<앵커 멘트>
독도 고유의 자생식물이 외래식물에 밀려 급속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서식지가 해마다 좁아지고 있는데, 다 성급한 사람들 탓입니다.
박순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바람에 씻기고 깎여 만들어진 바위섬 독도, 얕은 흙, 거센 바람을 이겨내지 못하는 식물은 뿌리내리기 어려운 곳입니다.
최악의 자연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은 갯제비쑥.
오래전 독도에 뿌리 내린 자생식물입니다.
하지만, 갯제비쑥 주변을 잎이 넓은 참소리쟁이가 둘러쌌습니다.
참소리쟁이는 육지에서 유입된 외래식물입니다.
<인터뷰>박선주(영남대 생물학과 교수) : "바람, 햇빛, 물 적절한 조건이 맞아야 발아를 하는데. 큰 잎들이 가려버리면 발아를 못하고 죽게 되거든요."
독도경비대 주변 계단 옆도 참소리쟁이가 점령했습니다.
독도 산 사면을 따라서는 역시 외래식물인 방가지똥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새들에게 치명적인 쇠무릎도 한쪽 사면을 둘러쌌습니다.
한쪽에서는 까마중도 꽃을 피웠습니다.
독도에는 현재 이런 외래식물 10여 종이 퍼져 있습니다.
2003년 12%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는 19%로 늘었습니다.
해마다 1%씩 늘고 있는 셈입니다.
사람의 신발에 붙은 흙이나 독도로 반입되는 화물 등을 통해 외래식물의 씨앗이 들어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뷰>박선주(영남대 생물학과 교수) : "독도라는 게 우리 땅이고 우리나라 생태주권인데 생태주권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것."
독도에서 그동안 진행돼 온 조림사업도 문제. 독도의 척박한 자연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나무를 심은 탓에 지금은 모두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독도를 푸르게 가꾸려는 목적이었지만 73년부터 23년 동안 심은 만 2천여 그루의 나무는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묘목의 흙에 묻어 들어온 외래식물 종자들이 생태계만 더 교란시켰습니다.
독도는 토양층이 빈약해 한번 생태계가 훼손되면 복원이 어렵습니다.
외래식물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자생식물을 심어 독도 고유의 생태계도 보존하고 독도도 푸르게 가꿀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순서입니다.
독도 고유의 자생식물이 외래식물에 밀려 급속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서식지가 해마다 좁아지고 있는데, 다 성급한 사람들 탓입니다.
박순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바람에 씻기고 깎여 만들어진 바위섬 독도, 얕은 흙, 거센 바람을 이겨내지 못하는 식물은 뿌리내리기 어려운 곳입니다.
최악의 자연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은 갯제비쑥.
오래전 독도에 뿌리 내린 자생식물입니다.
하지만, 갯제비쑥 주변을 잎이 넓은 참소리쟁이가 둘러쌌습니다.
참소리쟁이는 육지에서 유입된 외래식물입니다.
<인터뷰>박선주(영남대 생물학과 교수) : "바람, 햇빛, 물 적절한 조건이 맞아야 발아를 하는데. 큰 잎들이 가려버리면 발아를 못하고 죽게 되거든요."
독도경비대 주변 계단 옆도 참소리쟁이가 점령했습니다.
독도 산 사면을 따라서는 역시 외래식물인 방가지똥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새들에게 치명적인 쇠무릎도 한쪽 사면을 둘러쌌습니다.
한쪽에서는 까마중도 꽃을 피웠습니다.
독도에는 현재 이런 외래식물 10여 종이 퍼져 있습니다.
2003년 12%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는 19%로 늘었습니다.
해마다 1%씩 늘고 있는 셈입니다.
사람의 신발에 붙은 흙이나 독도로 반입되는 화물 등을 통해 외래식물의 씨앗이 들어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뷰>박선주(영남대 생물학과 교수) : "독도라는 게 우리 땅이고 우리나라 생태주권인데 생태주권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것."
독도에서 그동안 진행돼 온 조림사업도 문제. 독도의 척박한 자연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나무를 심은 탓에 지금은 모두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독도를 푸르게 가꾸려는 목적이었지만 73년부터 23년 동안 심은 만 2천여 그루의 나무는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묘목의 흙에 묻어 들어온 외래식물 종자들이 생태계만 더 교란시켰습니다.
독도는 토양층이 빈약해 한번 생태계가 훼손되면 복원이 어렵습니다.
외래식물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자생식물을 심어 독도 고유의 생태계도 보존하고 독도도 푸르게 가꿀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순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외래 식물, 독도 자생종 ‘위협’
-
- 입력 2009-11-02 21:18:22

<앵커 멘트>
독도 고유의 자생식물이 외래식물에 밀려 급속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서식지가 해마다 좁아지고 있는데, 다 성급한 사람들 탓입니다.
박순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바람에 씻기고 깎여 만들어진 바위섬 독도, 얕은 흙, 거센 바람을 이겨내지 못하는 식물은 뿌리내리기 어려운 곳입니다.
최악의 자연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은 갯제비쑥.
오래전 독도에 뿌리 내린 자생식물입니다.
하지만, 갯제비쑥 주변을 잎이 넓은 참소리쟁이가 둘러쌌습니다.
참소리쟁이는 육지에서 유입된 외래식물입니다.
<인터뷰>박선주(영남대 생물학과 교수) : "바람, 햇빛, 물 적절한 조건이 맞아야 발아를 하는데. 큰 잎들이 가려버리면 발아를 못하고 죽게 되거든요."
독도경비대 주변 계단 옆도 참소리쟁이가 점령했습니다.
독도 산 사면을 따라서는 역시 외래식물인 방가지똥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새들에게 치명적인 쇠무릎도 한쪽 사면을 둘러쌌습니다.
한쪽에서는 까마중도 꽃을 피웠습니다.
독도에는 현재 이런 외래식물 10여 종이 퍼져 있습니다.
2003년 12%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는 19%로 늘었습니다.
해마다 1%씩 늘고 있는 셈입니다.
사람의 신발에 붙은 흙이나 독도로 반입되는 화물 등을 통해 외래식물의 씨앗이 들어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뷰>박선주(영남대 생물학과 교수) : "독도라는 게 우리 땅이고 우리나라 생태주권인데 생태주권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것."
독도에서 그동안 진행돼 온 조림사업도 문제. 독도의 척박한 자연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나무를 심은 탓에 지금은 모두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독도를 푸르게 가꾸려는 목적이었지만 73년부터 23년 동안 심은 만 2천여 그루의 나무는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묘목의 흙에 묻어 들어온 외래식물 종자들이 생태계만 더 교란시켰습니다.
독도는 토양층이 빈약해 한번 생태계가 훼손되면 복원이 어렵습니다.
외래식물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자생식물을 심어 독도 고유의 생태계도 보존하고 독도도 푸르게 가꿀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순서입니다.
-
-

박순서 기자 pss@kbs.co.kr
박순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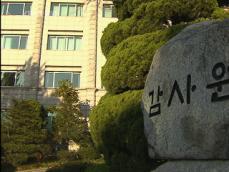



![[단독] ‘김건희 목걸이’ 모조품 확인…특검 ‘바꿔치기’ 의심](/data/news/2025/07/29/20250729_vaef8j.png)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