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연결도 다 끊은 남북…아직 대답없는 중국
입력 2016.02.12 (18:03)
수정 2016.02.12 (19: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이어 북한이 남측 인원 전원을 추방하고 군 통신선 등을 차단하면서 남북 간의 모든 연결 수단이 완전히 차단됐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현재 (남북 간) 통신선은 모두 단절된 상태"라고 밝혔다.
"남북 간 통신선 모두 단절...연락수단 아예 없다"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과 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에서 서해와 동해 각각 하나 씩 군 통신선을 운용하고 있었다. 이 중 동해 쪽은 2013년 이미 산불로 단절된 상태였는데, 이번에 서해 지역에 있던 전화와 팩스까지 완전히 차단됐다. 북한이 어제(11일) 오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남측 인원 추방과 동시에 남북 간 군 통신과 판문점 연락 통로를 폐쇄한다"고 발표한 즉시 벌어진 일이다.

문 대변인은 또 "판문점 지역에 통일부와 적십자의 2개 채널(전화, 팩스)가 운영되고 있었지만 이것도 차단된 것으로 안다"며 "지금은 필요할 경우 방송을 통해 입장을 주고받는 것만 가능하다, 유엔 같은 외교채널을 제외하고 남북 간 채널은 단절됐다"고 밝혔다.
남북 간에는 우리 측 2함대사령부와 북한 서해함대사령부의 우발 충돌을 막기 위해 설치됐던 서해 군통신연락소가 있었지만 이미 오래 전 끊겼고, 판문점에 있던 북한과 유엔사 간의 통신선도 2013년 북한이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했을 당시 폐쇄됐다. 현재는 유엔사가 북측에 입장을 전달할 때도 확성기를 이용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 "개성공단에 군 재배치 가능성 열려있다"
북측은 어제 개성공단 남측 인원 추방을 발표하면서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더 이상 재가동을 고려하지 않고 군사지역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북한이 군을) 재배치를 해야 한다면 개성공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지만 가능성은 열어두고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03년 개성공단 착공 이후 인민군 2군단의 최정예 6사단 예하 4개 대대 정도를 배치 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2개 대대를 조정하고 2개 대대는 전투가 아닌 경비를 위한 대대로 재편해 외곽 지역 경비를 맡긴 것이다. 64보병사단 사단도 송악산 이북으로 이동시켰고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로 무장했던 62포병여단도 후방으로 이전했다. 모두 개성에서 불과 60km 떨어진 서울,수도권을 겨냥한 부대였다. 북한이 이번에 개성공단 인접 군사분계선을 봉쇄하고 군사통제구역을 선포하면서 이 지역에 다시 군 병력과 무기가 배치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개성~문산 구간은 약 27km 거리로 남북 간 최단거리다.
.png)
"'대량살상무기에 개성공단 자금 이용' 판단 바뀌었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개성공단 유입 자금에 대한 '판단의 변화'를 이유로 들었다. 1~3차 북핵실험 당시 개성공단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던 정부의 설명이 왜 바뀌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으로 들어간)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해 정부의 판단이 바뀌었으니 공식 입장도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된다고 판단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판단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오늘(1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임금 등 현금이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된다는 우려는 여러 측에서 있었다. 정부가 여러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개는 불가능한 자료라며 "여러가지 갖고 있는 정보사항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선제 제재에도 돌아보지 않는 중국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불리던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만큼, 정부는 특히 중국의 고강도 대북 경제 제재 동참에 기대를 걸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많은 나라들이 안보리 제재가 합의돼서 효력이 발생할 경우 개성공단은 어떻게 되는것이냐고 많이 물어왔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그에 대한 답"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보이지 않는 강한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가동 중단 직후 한중 외교장관의 만남에서도 중국은 별다른 변화된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독일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현지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를 언급하면서 중국 측의 고강도 대북제재 동참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왕이 부장은 안보리 결의 협의를 가속화해나갈 필요에는 공감했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한중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기존 입장이 거의 변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안보 관련 조치에 있어 주변국의 이해와 우려를 감안해 신중히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드 문제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중국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관련해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남북 간 통신선 모두 단절...연락수단 아예 없다"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과 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에서 서해와 동해 각각 하나 씩 군 통신선을 운용하고 있었다. 이 중 동해 쪽은 2013년 이미 산불로 단절된 상태였는데, 이번에 서해 지역에 있던 전화와 팩스까지 완전히 차단됐다. 북한이 어제(11일) 오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남측 인원 추방과 동시에 남북 간 군 통신과 판문점 연락 통로를 폐쇄한다"고 발표한 즉시 벌어진 일이다.

문 대변인은 또 "판문점 지역에 통일부와 적십자의 2개 채널(전화, 팩스)가 운영되고 있었지만 이것도 차단된 것으로 안다"며 "지금은 필요할 경우 방송을 통해 입장을 주고받는 것만 가능하다, 유엔 같은 외교채널을 제외하고 남북 간 채널은 단절됐다"고 밝혔다.
남북 간에는 우리 측 2함대사령부와 북한 서해함대사령부의 우발 충돌을 막기 위해 설치됐던 서해 군통신연락소가 있었지만 이미 오래 전 끊겼고, 판문점에 있던 북한과 유엔사 간의 통신선도 2013년 북한이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했을 당시 폐쇄됐다. 현재는 유엔사가 북측에 입장을 전달할 때도 확성기를 이용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 "개성공단에 군 재배치 가능성 열려있다"
북측은 어제 개성공단 남측 인원 추방을 발표하면서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더 이상 재가동을 고려하지 않고 군사지역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북한이 군을) 재배치를 해야 한다면 개성공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지만 가능성은 열어두고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03년 개성공단 착공 이후 인민군 2군단의 최정예 6사단 예하 4개 대대 정도를 배치 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2개 대대를 조정하고 2개 대대는 전투가 아닌 경비를 위한 대대로 재편해 외곽 지역 경비를 맡긴 것이다. 64보병사단 사단도 송악산 이북으로 이동시켰고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로 무장했던 62포병여단도 후방으로 이전했다. 모두 개성에서 불과 60km 떨어진 서울,수도권을 겨냥한 부대였다. 북한이 이번에 개성공단 인접 군사분계선을 봉쇄하고 군사통제구역을 선포하면서 이 지역에 다시 군 병력과 무기가 배치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개성~문산 구간은 약 27km 거리로 남북 간 최단거리다.
.png)
"'대량살상무기에 개성공단 자금 이용' 판단 바뀌었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개성공단 유입 자금에 대한 '판단의 변화'를 이유로 들었다. 1~3차 북핵실험 당시 개성공단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던 정부의 설명이 왜 바뀌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으로 들어간)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해 정부의 판단이 바뀌었으니 공식 입장도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된다고 판단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판단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오늘(1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임금 등 현금이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된다는 우려는 여러 측에서 있었다. 정부가 여러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개는 불가능한 자료라며 "여러가지 갖고 있는 정보사항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선제 제재에도 돌아보지 않는 중국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불리던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만큼, 정부는 특히 중국의 고강도 대북 경제 제재 동참에 기대를 걸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많은 나라들이 안보리 제재가 합의돼서 효력이 발생할 경우 개성공단은 어떻게 되는것이냐고 많이 물어왔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그에 대한 답"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보이지 않는 강한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가동 중단 직후 한중 외교장관의 만남에서도 중국은 별다른 변화된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독일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현지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를 언급하면서 중국 측의 고강도 대북제재 동참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왕이 부장은 안보리 결의 협의를 가속화해나갈 필요에는 공감했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한중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기존 입장이 거의 변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안보 관련 조치에 있어 주변국의 이해와 우려를 감안해 신중히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드 문제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중국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관련해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마지막 연결도 다 끊은 남북…아직 대답없는 중국
-
- 입력 2016-02-12 18:03:37
- 수정2016-02-12 19:40:16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이어 북한이 남측 인원 전원을 추방하고 군 통신선 등을 차단하면서 남북 간의 모든 연결 수단이 완전히 차단됐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현재 (남북 간) 통신선은 모두 단절된 상태"라고 밝혔다.
"남북 간 통신선 모두 단절...연락수단 아예 없다"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과 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에서 서해와 동해 각각 하나 씩 군 통신선을 운용하고 있었다. 이 중 동해 쪽은 2013년 이미 산불로 단절된 상태였는데, 이번에 서해 지역에 있던 전화와 팩스까지 완전히 차단됐다. 북한이 어제(11일) 오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남측 인원 추방과 동시에 남북 간 군 통신과 판문점 연락 통로를 폐쇄한다"고 발표한 즉시 벌어진 일이다.

문 대변인은 또 "판문점 지역에 통일부와 적십자의 2개 채널(전화, 팩스)가 운영되고 있었지만 이것도 차단된 것으로 안다"며 "지금은 필요할 경우 방송을 통해 입장을 주고받는 것만 가능하다, 유엔 같은 외교채널을 제외하고 남북 간 채널은 단절됐다"고 밝혔다.
남북 간에는 우리 측 2함대사령부와 북한 서해함대사령부의 우발 충돌을 막기 위해 설치됐던 서해 군통신연락소가 있었지만 이미 오래 전 끊겼고, 판문점에 있던 북한과 유엔사 간의 통신선도 2013년 북한이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했을 당시 폐쇄됐다. 현재는 유엔사가 북측에 입장을 전달할 때도 확성기를 이용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 "개성공단에 군 재배치 가능성 열려있다"
북측은 어제 개성공단 남측 인원 추방을 발표하면서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더 이상 재가동을 고려하지 않고 군사지역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북한이 군을) 재배치를 해야 한다면 개성공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지만 가능성은 열어두고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03년 개성공단 착공 이후 인민군 2군단의 최정예 6사단 예하 4개 대대 정도를 배치 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2개 대대를 조정하고 2개 대대는 전투가 아닌 경비를 위한 대대로 재편해 외곽 지역 경비를 맡긴 것이다. 64보병사단 사단도 송악산 이북으로 이동시켰고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로 무장했던 62포병여단도 후방으로 이전했다. 모두 개성에서 불과 60km 떨어진 서울,수도권을 겨냥한 부대였다. 북한이 이번에 개성공단 인접 군사분계선을 봉쇄하고 군사통제구역을 선포하면서 이 지역에 다시 군 병력과 무기가 배치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개성~문산 구간은 약 27km 거리로 남북 간 최단거리다.
.png)
"'대량살상무기에 개성공단 자금 이용' 판단 바뀌었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개성공단 유입 자금에 대한 '판단의 변화'를 이유로 들었다. 1~3차 북핵실험 당시 개성공단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던 정부의 설명이 왜 바뀌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으로 들어간)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해 정부의 판단이 바뀌었으니 공식 입장도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된다고 판단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판단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오늘(1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임금 등 현금이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된다는 우려는 여러 측에서 있었다. 정부가 여러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개는 불가능한 자료라며 "여러가지 갖고 있는 정보사항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선제 제재에도 돌아보지 않는 중국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불리던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만큼, 정부는 특히 중국의 고강도 대북 경제 제재 동참에 기대를 걸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많은 나라들이 안보리 제재가 합의돼서 효력이 발생할 경우 개성공단은 어떻게 되는것이냐고 많이 물어왔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그에 대한 답"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보이지 않는 강한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가동 중단 직후 한중 외교장관의 만남에서도 중국은 별다른 변화된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독일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현지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를 언급하면서 중국 측의 고강도 대북제재 동참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왕이 부장은 안보리 결의 협의를 가속화해나갈 필요에는 공감했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한중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기존 입장이 거의 변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안보 관련 조치에 있어 주변국의 이해와 우려를 감안해 신중히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드 문제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중국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관련해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남북 간 통신선 모두 단절...연락수단 아예 없다"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과 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에서 서해와 동해 각각 하나 씩 군 통신선을 운용하고 있었다. 이 중 동해 쪽은 2013년 이미 산불로 단절된 상태였는데, 이번에 서해 지역에 있던 전화와 팩스까지 완전히 차단됐다. 북한이 어제(11일) 오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남측 인원 추방과 동시에 남북 간 군 통신과 판문점 연락 통로를 폐쇄한다"고 발표한 즉시 벌어진 일이다.

문 대변인은 또 "판문점 지역에 통일부와 적십자의 2개 채널(전화, 팩스)가 운영되고 있었지만 이것도 차단된 것으로 안다"며 "지금은 필요할 경우 방송을 통해 입장을 주고받는 것만 가능하다, 유엔 같은 외교채널을 제외하고 남북 간 채널은 단절됐다"고 밝혔다.
남북 간에는 우리 측 2함대사령부와 북한 서해함대사령부의 우발 충돌을 막기 위해 설치됐던 서해 군통신연락소가 있었지만 이미 오래 전 끊겼고, 판문점에 있던 북한과 유엔사 간의 통신선도 2013년 북한이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했을 당시 폐쇄됐다. 현재는 유엔사가 북측에 입장을 전달할 때도 확성기를 이용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 "개성공단에 군 재배치 가능성 열려있다"
북측은 어제 개성공단 남측 인원 추방을 발표하면서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더 이상 재가동을 고려하지 않고 군사지역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북한이 군을) 재배치를 해야 한다면 개성공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지만 가능성은 열어두고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03년 개성공단 착공 이후 인민군 2군단의 최정예 6사단 예하 4개 대대 정도를 배치 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2개 대대를 조정하고 2개 대대는 전투가 아닌 경비를 위한 대대로 재편해 외곽 지역 경비를 맡긴 것이다. 64보병사단 사단도 송악산 이북으로 이동시켰고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로 무장했던 62포병여단도 후방으로 이전했다. 모두 개성에서 불과 60km 떨어진 서울,수도권을 겨냥한 부대였다. 북한이 이번에 개성공단 인접 군사분계선을 봉쇄하고 군사통제구역을 선포하면서 이 지역에 다시 군 병력과 무기가 배치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개성~문산 구간은 약 27km 거리로 남북 간 최단거리다.
.png)
"'대량살상무기에 개성공단 자금 이용' 판단 바뀌었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개성공단 유입 자금에 대한 '판단의 변화'를 이유로 들었다. 1~3차 북핵실험 당시 개성공단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던 정부의 설명이 왜 바뀌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으로 들어간)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해 정부의 판단이 바뀌었으니 공식 입장도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된다고 판단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판단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오늘(1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임금 등 현금이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된다는 우려는 여러 측에서 있었다. 정부가 여러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개는 불가능한 자료라며 "여러가지 갖고 있는 정보사항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선제 제재에도 돌아보지 않는 중국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불리던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만큼, 정부는 특히 중국의 고강도 대북 경제 제재 동참에 기대를 걸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많은 나라들이 안보리 제재가 합의돼서 효력이 발생할 경우 개성공단은 어떻게 되는것이냐고 많이 물어왔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그에 대한 답"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보이지 않는 강한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가동 중단 직후 한중 외교장관의 만남에서도 중국은 별다른 변화된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독일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현지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를 언급하면서 중국 측의 고강도 대북제재 동참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왕이 부장은 안보리 결의 협의를 가속화해나갈 필요에는 공감했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한중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기존 입장이 거의 변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안보 관련 조치에 있어 주변국의 이해와 우려를 감안해 신중히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드 문제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중국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관련해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
-

이정민 기자 mani@kbs.co.kr
이정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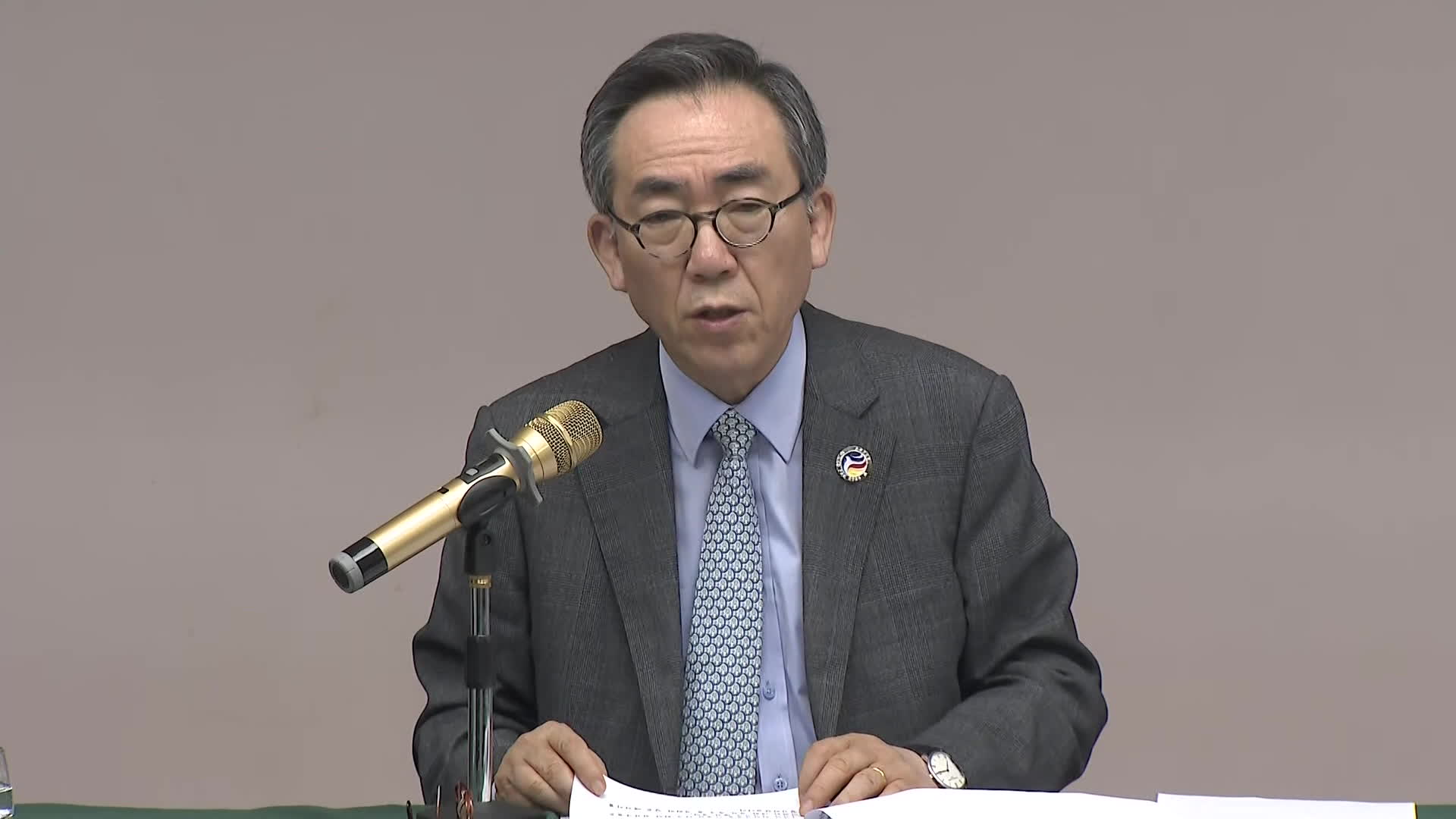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