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 ② 죽을 때 비참한 나라 한국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년 넘게 피부암으로 투병한 박성렬(33) 씨의 말입니다. 박 씨는 3년 동안 12차례 넘게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치료받을 때 한 번에 1억씩 들 때도 있었어요. 무균실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라며 금전적 압박감을 털어놨습니다.

치료를 받는 과정도 '악몽' 같았습니다. 항암치료는 전신에 방사선을 쪼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삶을 포기한 채 항암치료에만 매달렸지만 9번째 항암치료를 받고 나서 피부가 다 벗겨졌습니다. 고통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박 씨는 "검사를 받으러 갈 때마다 1시간씩 대기를 해야 했어요. 그러면 너무 추워서 '덜덜덜' 떨었어요. 점퍼를 입고 시트를 얻어서 뒤집어써도 추웠어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엄마 나는 먼저 갈 테니 누나와 예쁜 조카들하고 더 살다 와'라고 울면서 말한 적도 있어요"라고 힘든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가족들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삼중고'를 겪습니다. 투병 기간 내내 박 씨를 돌봤던 어머니 장금순 씨는 환자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 씨는 "성렬이가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면 암환자 응급실에 가요. 병원에서 아이는 좁은 침대에다 눕혀놓고 보호자는 밤새 의자에 앉아있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박스 같은 거 갖다 놓고 옆에 깔고 드러눕고 자고 그래요. 거기서 하루를 지내는 건 진짜 고문이에요. 환자 돌보다 보호자도 다 생병이 나는 거죠"라고 말했습니다.
죽을 때 비참한 나라
수술과 항암치료 등이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완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끝까지 극단적인 치료를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화치료나 호스피스는 치료의 '포기'라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한 자료(2011년)에 따르면 1인 환자의 월평균 치료비가 급증하는 시기는 '사망 직전'입니다, 사망 2년 전의 월평균 진료비는 약 50만 원입니다. 하지만 사망 1달 전 진료비는 280만 원까지 5배 넘게 치솟습니다.
치료 효과 없이 투병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 치료'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말기 환자 10명 가운데 3명이 인공호흡기 등에 의지해 생명을 유지하다 숨을 거둡니다.
무조건 붙잡아야 하나?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무리한 연명 치료는 환자와 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2014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노인 10명 중 9명이 연명 치료 중단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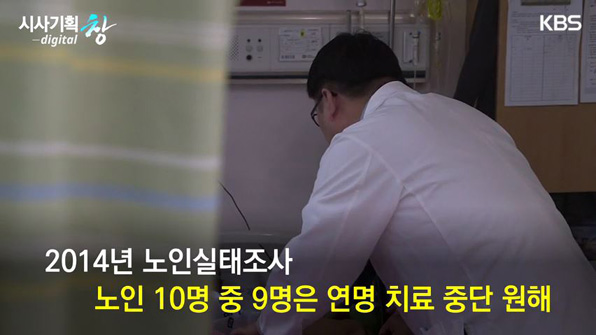
<어떻게 죽을 것인가>의 저자 아툴 가완디 하버드 의대 교수는 "연명 치료는 환자가 가족과 친구에게 인사를 건네는 대신 어려운 의학적 싸움을 벌이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장 김대균 교수 역시 "70년을 살다 돌아가시면 그분이 살아온 70년의 삶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이 정리되지도 않고 기억되지도 않는 것 같다"며 연명 치료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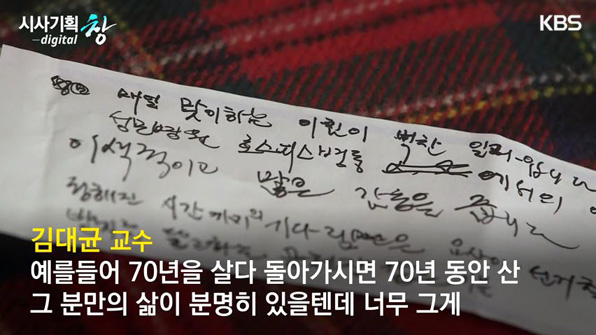
하지만 현실적으로 연명 치료를 중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서이종 교수는 "연명 치료 결정과 선택의 첫 출발은 담당 의사가 더 이상 치료 효과가 없다고 '의료적 무의미성'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치료 효과가 없어 치료가 무의미해질 때도 의료인을 포함한 의료기관에 어떠한 설명 의무도 없다"고 현실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연명치료 여부가 전문적인 의료진의 판단이 아닌 환자와 가족의 의견에 좌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북부병원 완화의료팀 김윤덕 팀장은 "말기 암 환자가 임종 직전에 다시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도 있다. 의료 행위가 효과가 없다고 설명을 다 해도 가족이 다 협의했다면 그냥 받아들인다"고 마지막까지 치료의 끈을 놓지 못하는 환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속고 있어요"

"사람들은 속고 있어요. 지금...자기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의미 없는 치료(cure) 대신 보살핌(care)를 선택한 박성렬 씨가 전하는 말입니다.
박 씨는 결국 지난 2월 용인 샘물 호스피스로 옮겨 어머니와 차분하게 삶의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박 씨는 "병원에 계속 있는 것은 미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스피스로 옮기고 나서 병원에 있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이 편안해요. 사람은 누구나 한번은 죽잖아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행복하게 죽을 수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는 죽음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삶의 질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죽을 때 비참한 나라, 한국에서 우리가 '제대로' 생을 마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잘 죽는 법 ‘웰다잉’]시리즈
☞ ① 죽음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 ② 죽을 때 비참한 나라 한국
☞ ③ ‘호스피스’를 아시나요
☞ ④ 호스피스는 ‘죽음 대기소’가 아닙니다
☞ ⑤ ‘죽음의 질’ 1위 비결은?
☞ ⑥ 스스로 선택하는 죽음 ‘존엄사’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웰다잉] ② 죽을 때 비참한 나라 한국
-
- 입력 2016-05-08 11:00:26
- 수정2016-05-12 09:19:56

3년 넘게 피부암으로 투병한 박성렬(33) 씨의 말입니다. 박 씨는 3년 동안 12차례 넘게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치료받을 때 한 번에 1억씩 들 때도 있었어요. 무균실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라며 금전적 압박감을 털어놨습니다.

치료를 받는 과정도 '악몽' 같았습니다. 항암치료는 전신에 방사선을 쪼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삶을 포기한 채 항암치료에만 매달렸지만 9번째 항암치료를 받고 나서 피부가 다 벗겨졌습니다. 고통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박 씨는 "검사를 받으러 갈 때마다 1시간씩 대기를 해야 했어요. 그러면 너무 추워서 '덜덜덜' 떨었어요. 점퍼를 입고 시트를 얻어서 뒤집어써도 추웠어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엄마 나는 먼저 갈 테니 누나와 예쁜 조카들하고 더 살다 와'라고 울면서 말한 적도 있어요"라고 힘든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가족들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삼중고'를 겪습니다. 투병 기간 내내 박 씨를 돌봤던 어머니 장금순 씨는 환자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 씨는 "성렬이가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면 암환자 응급실에 가요. 병원에서 아이는 좁은 침대에다 눕혀놓고 보호자는 밤새 의자에 앉아있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박스 같은 거 갖다 놓고 옆에 깔고 드러눕고 자고 그래요. 거기서 하루를 지내는 건 진짜 고문이에요. 환자 돌보다 보호자도 다 생병이 나는 거죠"라고 말했습니다.
죽을 때 비참한 나라
수술과 항암치료 등이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완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끝까지 극단적인 치료를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화치료나 호스피스는 치료의 '포기'라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한 자료(2011년)에 따르면 1인 환자의 월평균 치료비가 급증하는 시기는 '사망 직전'입니다, 사망 2년 전의 월평균 진료비는 약 50만 원입니다. 하지만 사망 1달 전 진료비는 280만 원까지 5배 넘게 치솟습니다.
치료 효과 없이 투병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 치료'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말기 환자 10명 가운데 3명이 인공호흡기 등에 의지해 생명을 유지하다 숨을 거둡니다.
무조건 붙잡아야 하나?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무리한 연명 치료는 환자와 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2014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노인 10명 중 9명이 연명 치료 중단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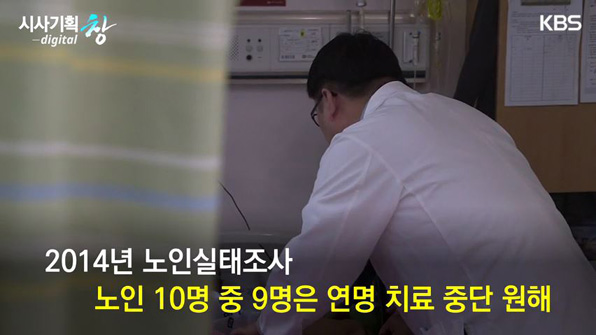
<어떻게 죽을 것인가>의 저자 아툴 가완디 하버드 의대 교수는 "연명 치료는 환자가 가족과 친구에게 인사를 건네는 대신 어려운 의학적 싸움을 벌이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장 김대균 교수 역시 "70년을 살다 돌아가시면 그분이 살아온 70년의 삶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이 정리되지도 않고 기억되지도 않는 것 같다"며 연명 치료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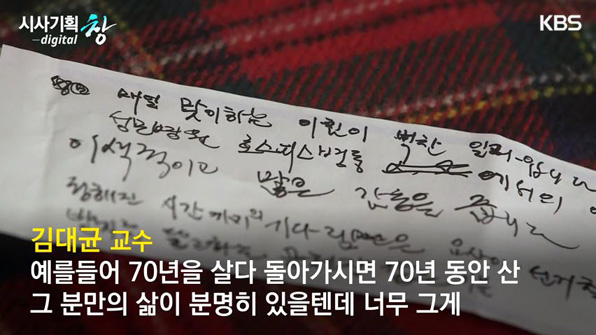
하지만 현실적으로 연명 치료를 중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서이종 교수는 "연명 치료 결정과 선택의 첫 출발은 담당 의사가 더 이상 치료 효과가 없다고 '의료적 무의미성'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치료 효과가 없어 치료가 무의미해질 때도 의료인을 포함한 의료기관에 어떠한 설명 의무도 없다"고 현실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연명치료 여부가 전문적인 의료진의 판단이 아닌 환자와 가족의 의견에 좌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북부병원 완화의료팀 김윤덕 팀장은 "말기 암 환자가 임종 직전에 다시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도 있다. 의료 행위가 효과가 없다고 설명을 다 해도 가족이 다 협의했다면 그냥 받아들인다"고 마지막까지 치료의 끈을 놓지 못하는 환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속고 있어요"

"사람들은 속고 있어요. 지금...자기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의미 없는 치료(cure) 대신 보살핌(care)를 선택한 박성렬 씨가 전하는 말입니다.
박 씨는 결국 지난 2월 용인 샘물 호스피스로 옮겨 어머니와 차분하게 삶의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박 씨는 "병원에 계속 있는 것은 미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스피스로 옮기고 나서 병원에 있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이 편안해요. 사람은 누구나 한번은 죽잖아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행복하게 죽을 수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는 죽음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삶의 질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죽을 때 비참한 나라, 한국에서 우리가 '제대로' 생을 마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잘 죽는 법 ‘웰다잉’]시리즈
☞ ① 죽음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 ② 죽을 때 비참한 나라 한국
☞ ③ ‘호스피스’를 아시나요
☞ ④ 호스피스는 ‘죽음 대기소’가 아닙니다
☞ ⑤ ‘죽음의 질’ 1위 비결은?
☞ ⑥ 스스로 선택하는 죽음 ‘존엄사’
-
-

이소정 기자 sojeong2@kbs.co.kr
이소정 기자의 기사 모음 -

최은진 기자 ejch@kbs.co.kr
최은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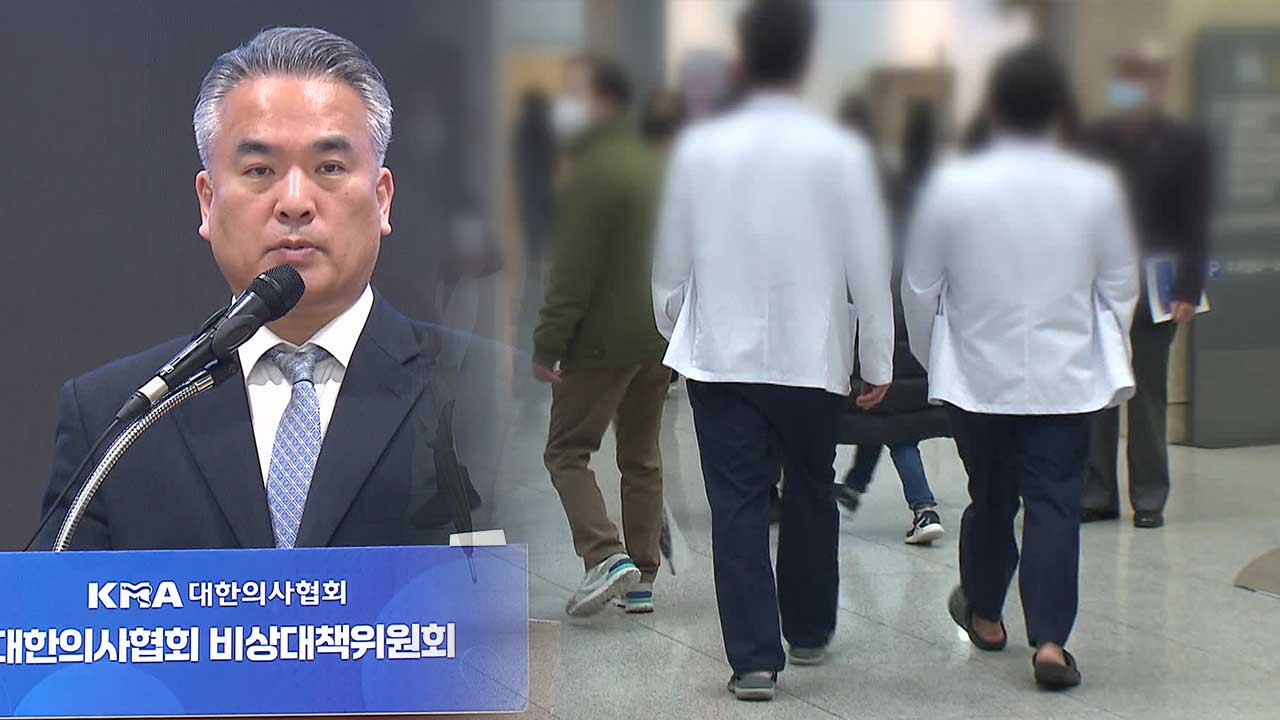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