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책방] 약탈전쟁의 대명사 ‘백년전쟁 1337~1453’
입력 2018.05.16 (07:38)
수정 2018.05.16 (07: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백년전쟁(The Hundred Years War)1337~1453 중세의 역사를 바꾼 영국-프랑스 간의 백년전쟁 이야기】은 전쟁사가 아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프랑스와 영국인 모두 일상의 삶과 정신세계가 크게 뒤틀렸던 고통의 역사, 생존을 위한 투쟁의 역사다.
명분은 '왕위계승'…실리는 '부의 이동'
긴 전쟁의 먹구름은 프랑스 국왕 샤를 4세가 자식 없이 사망하면서 몰려왔다. 1337년 영국 국왕 에드워드 3세가 자신의 어머니 이사벨이 샤를 4세의 누이동생인 점을 내세워 '내가 프랑스 왕이다'라고 주장하면서부터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프랑스 내 자신의 영지를 뺏길 상황에 처하자 부랴부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영국의 당돌한 군주는 불과 만 9천 명 남짓 되는 병력으로 인구 2천 5백만의 프랑스에 상륙해 긴 전쟁의 서막을 연다.
'백년전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주요 전투는 전쟁사에 빠지지 않는 '크레시 전투'를 비롯해 네다섯 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군인이 아닌 민간인을 상대로 한 약탈과 납치전쟁만큼은 그야말로 100년 내내 계속된다. 교회와 수도원 재산 약탈은 물론, 성직자들까지도 끌려가 몸값이 매겨지거나 살육의 대상이 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반면 영국에는 프랑스에서 흘러들어온 온갖 재화들이 넘치게 된다. 그야말로 부의 대이동이었던 셈이다.
주요 전투에서 대패한 프랑스
사실 프랑스는 잔 다르크가 등장하는 1429년까지 긴 세월 동안 영국군에 질질 끌려다녔다. 저자는 영국군 지휘관의 탁월한 전술과 효율적인 병력운용, 그리고 사거리가 길고 파괴력이 큰 '장궁'과 같은 비교우위의 무기들을 최대한 활용한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묘사한다.
백년전쟁 초기인 1346년 에드워드 3세가 군대를 이끌고 프랑스의 대군과 마주한 크레시 전투는 대표적 사례다. 전투 당일 프랑스군은 최정예 2만 명의 철갑으로 무장한 '중기병' 만으로도 영국군 전체를 압도했다. 누가 보더라도 프랑스의 완승이 예상되는 싸움이었다.
하지만 영국군에게는 사거리가 긴 장궁을 든 병사 7천여 명이 있었다. 이들이 소낙비처럼 쏘아대는 화살에 그야말로 프랑스군은 추풍낙엽 신세였다. 병력이 많다는 이점이 효율적 지휘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움직임을 둔하게 만드는 단점이 돼버렸다. 프랑스에겐 총처럼 겨눠서 쏘는 이른바 '석궁'이 있었지만, 사거리가 짧아 무용지물이었다. 프랑스의 참패였다. 푸아티에 전투(1356), 아쟁쿠르 전투(1415)에서도 병력은 프랑스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역시 대패하고 만다.
 잉글랜드가 거둔 크나큰 승전 가운데 하나인 1346년의 크레시 전투
잉글랜드가 거둔 크나큰 승전 가운데 하나인 1346년의 크레시 전투
'백년전쟁'이 남긴 것은...
프랑스 땅에서 백년전쟁이 시작된 1337년. 한반도에선 황혼 무렵의 고려가 왜구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기 시작하던 때다. 이웃 섬나라에 의해 골치를 썩었던 것은 동시대 고려나 프랑스나 마찬가지였다.
전쟁 초기 프랑스는 엄청난 국부를 바탕으로 유럽의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다. 당시 영국의 인구는 프랑스의 5분의 1인 5백만 명 정도. 농업생산력은 비교할 수 없이 초라했기에 도저히 프랑스의 상대가 안 돼 보이는 약소국이었다. 지난한 전쟁에서 영국은 결과적으로 패하고 프랑스내 영토도 잃었지만, 부의 약탈을 통해 유럽의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백년전쟁 마지막 해인 1453년 카스티용 전투에서 프랑스는 대포를 도입해 영국군을 마침내 격파한다. 저자는 그러나 이후에도 끝없이 계속된 영국의 프랑스 침공야욕을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1558년 마지막 교두보였던 칼레를 상실한 뒤에도, 잉글랜드 군주들은 1802년 아미앵 화약을 맺을 때까지 계속해서 프랑스 국왕임을 자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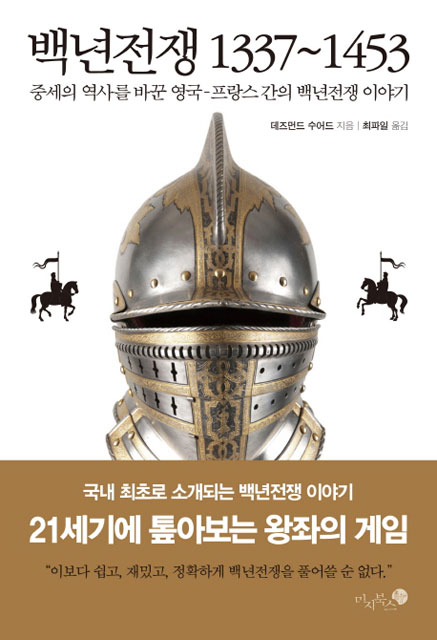
저자 데즈먼드 수어드(Desmond Seward)는 끔찍한 전란을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 근대국가 형성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백여 년에 걸친 사건들 하나하나가 사실적으로 그려지는 이유다. 때문에 회화적 묘사가 가득한 이 책을 읽으면 머릿속으로 그 참상을 그려보는 게 어렵지 않다. 삶과 죽음은 늘 공존하지만 적어도 눈앞에서 매일 목도하지 않아도 되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면서 말이다.
'영국' vs. '프랑스' 증오와 경멸감 속에 확립된 국가상
저자에겐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가 주요 관심사다. 그의 책을 읽으면 유럽에서 소위 '근대의 싹' 이 어디서 어떻게 자라나게 됐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 영국의 경우엔 아마도 '부의 약탈'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그래서인지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 전쟁 묘사는 '누가 이겼다' 정도로 쓱 보고 넘어갈 수 없게 만든다. 때문에 읽는 이로서 마냥 편하지는 않다. 피비린내 나는 전장의 살육은 물론, 탐욕스런 약탈자가 휩쓸고 간 뒤의 참상과 고통이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시기 '잔인한 약탈자'영국인들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이 전 프랑스 사회로 불길처럼 번져나갔고, 영국에서는 '먹잇감'으로 전락한 프랑스인에 대한 냉소와 경멸감이 확산했다고 본다. 저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서술한다.
"잉글랜드 지배계급은 당연히 더는 프랑스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심지어 국왕의 제1 언어도 이제는 영어가 됐다. 의심의 여지 없이 15세기 잉글랜드인과 프랑스인 사이의 적대감은 진정 민족주의적인 외국인 혐오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었다."
『백년전쟁 1337~1453』데즈먼드 수어드 지음, 최파일 옮김, 출판사 미지북스, 2018년 3월
명분은 '왕위계승'…실리는 '부의 이동'
긴 전쟁의 먹구름은 프랑스 국왕 샤를 4세가 자식 없이 사망하면서 몰려왔다. 1337년 영국 국왕 에드워드 3세가 자신의 어머니 이사벨이 샤를 4세의 누이동생인 점을 내세워 '내가 프랑스 왕이다'라고 주장하면서부터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프랑스 내 자신의 영지를 뺏길 상황에 처하자 부랴부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영국의 당돌한 군주는 불과 만 9천 명 남짓 되는 병력으로 인구 2천 5백만의 프랑스에 상륙해 긴 전쟁의 서막을 연다.
'백년전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주요 전투는 전쟁사에 빠지지 않는 '크레시 전투'를 비롯해 네다섯 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군인이 아닌 민간인을 상대로 한 약탈과 납치전쟁만큼은 그야말로 100년 내내 계속된다. 교회와 수도원 재산 약탈은 물론, 성직자들까지도 끌려가 몸값이 매겨지거나 살육의 대상이 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반면 영국에는 프랑스에서 흘러들어온 온갖 재화들이 넘치게 된다. 그야말로 부의 대이동이었던 셈이다.
주요 전투에서 대패한 프랑스
사실 프랑스는 잔 다르크가 등장하는 1429년까지 긴 세월 동안 영국군에 질질 끌려다녔다. 저자는 영국군 지휘관의 탁월한 전술과 효율적인 병력운용, 그리고 사거리가 길고 파괴력이 큰 '장궁'과 같은 비교우위의 무기들을 최대한 활용한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묘사한다.
백년전쟁 초기인 1346년 에드워드 3세가 군대를 이끌고 프랑스의 대군과 마주한 크레시 전투는 대표적 사례다. 전투 당일 프랑스군은 최정예 2만 명의 철갑으로 무장한 '중기병' 만으로도 영국군 전체를 압도했다. 누가 보더라도 프랑스의 완승이 예상되는 싸움이었다.
하지만 영국군에게는 사거리가 긴 장궁을 든 병사 7천여 명이 있었다. 이들이 소낙비처럼 쏘아대는 화살에 그야말로 프랑스군은 추풍낙엽 신세였다. 병력이 많다는 이점이 효율적 지휘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움직임을 둔하게 만드는 단점이 돼버렸다. 프랑스에겐 총처럼 겨눠서 쏘는 이른바 '석궁'이 있었지만, 사거리가 짧아 무용지물이었다. 프랑스의 참패였다. 푸아티에 전투(1356), 아쟁쿠르 전투(1415)에서도 병력은 프랑스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역시 대패하고 만다.
 잉글랜드가 거둔 크나큰 승전 가운데 하나인 1346년의 크레시 전투
잉글랜드가 거둔 크나큰 승전 가운데 하나인 1346년의 크레시 전투'백년전쟁'이 남긴 것은...
프랑스 땅에서 백년전쟁이 시작된 1337년. 한반도에선 황혼 무렵의 고려가 왜구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기 시작하던 때다. 이웃 섬나라에 의해 골치를 썩었던 것은 동시대 고려나 프랑스나 마찬가지였다.
전쟁 초기 프랑스는 엄청난 국부를 바탕으로 유럽의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다. 당시 영국의 인구는 프랑스의 5분의 1인 5백만 명 정도. 농업생산력은 비교할 수 없이 초라했기에 도저히 프랑스의 상대가 안 돼 보이는 약소국이었다. 지난한 전쟁에서 영국은 결과적으로 패하고 프랑스내 영토도 잃었지만, 부의 약탈을 통해 유럽의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백년전쟁 마지막 해인 1453년 카스티용 전투에서 프랑스는 대포를 도입해 영국군을 마침내 격파한다. 저자는 그러나 이후에도 끝없이 계속된 영국의 프랑스 침공야욕을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1558년 마지막 교두보였던 칼레를 상실한 뒤에도, 잉글랜드 군주들은 1802년 아미앵 화약을 맺을 때까지 계속해서 프랑스 국왕임을 자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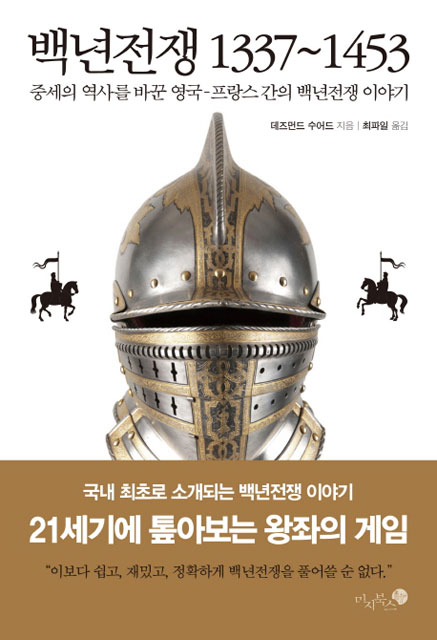
저자 데즈먼드 수어드(Desmond Seward)는 끔찍한 전란을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 근대국가 형성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백여 년에 걸친 사건들 하나하나가 사실적으로 그려지는 이유다. 때문에 회화적 묘사가 가득한 이 책을 읽으면 머릿속으로 그 참상을 그려보는 게 어렵지 않다. 삶과 죽음은 늘 공존하지만 적어도 눈앞에서 매일 목도하지 않아도 되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면서 말이다.
'영국' vs. '프랑스' 증오와 경멸감 속에 확립된 국가상
저자에겐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가 주요 관심사다. 그의 책을 읽으면 유럽에서 소위 '근대의 싹' 이 어디서 어떻게 자라나게 됐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 영국의 경우엔 아마도 '부의 약탈'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그래서인지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 전쟁 묘사는 '누가 이겼다' 정도로 쓱 보고 넘어갈 수 없게 만든다. 때문에 읽는 이로서 마냥 편하지는 않다. 피비린내 나는 전장의 살육은 물론, 탐욕스런 약탈자가 휩쓸고 간 뒤의 참상과 고통이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시기 '잔인한 약탈자'영국인들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이 전 프랑스 사회로 불길처럼 번져나갔고, 영국에서는 '먹잇감'으로 전락한 프랑스인에 대한 냉소와 경멸감이 확산했다고 본다. 저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서술한다.
"잉글랜드 지배계급은 당연히 더는 프랑스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심지어 국왕의 제1 언어도 이제는 영어가 됐다. 의심의 여지 없이 15세기 잉글랜드인과 프랑스인 사이의 적대감은 진정 민족주의적인 외국인 혐오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었다."
『백년전쟁 1337~1453』데즈먼드 수어드 지음, 최파일 옮김, 출판사 미지북스, 2018년 3월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의도 책방] 약탈전쟁의 대명사 ‘백년전쟁 1337~1453’
-
- 입력 2018-05-16 07:38:16
- 수정2018-05-16 07:39:48

【백년전쟁(The Hundred Years War)1337~1453 중세의 역사를 바꾼 영국-프랑스 간의 백년전쟁 이야기】은 전쟁사가 아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프랑스와 영국인 모두 일상의 삶과 정신세계가 크게 뒤틀렸던 고통의 역사, 생존을 위한 투쟁의 역사다.
명분은 '왕위계승'…실리는 '부의 이동'
긴 전쟁의 먹구름은 프랑스 국왕 샤를 4세가 자식 없이 사망하면서 몰려왔다. 1337년 영국 국왕 에드워드 3세가 자신의 어머니 이사벨이 샤를 4세의 누이동생인 점을 내세워 '내가 프랑스 왕이다'라고 주장하면서부터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프랑스 내 자신의 영지를 뺏길 상황에 처하자 부랴부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영국의 당돌한 군주는 불과 만 9천 명 남짓 되는 병력으로 인구 2천 5백만의 프랑스에 상륙해 긴 전쟁의 서막을 연다.
'백년전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주요 전투는 전쟁사에 빠지지 않는 '크레시 전투'를 비롯해 네다섯 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군인이 아닌 민간인을 상대로 한 약탈과 납치전쟁만큼은 그야말로 100년 내내 계속된다. 교회와 수도원 재산 약탈은 물론, 성직자들까지도 끌려가 몸값이 매겨지거나 살육의 대상이 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반면 영국에는 프랑스에서 흘러들어온 온갖 재화들이 넘치게 된다. 그야말로 부의 대이동이었던 셈이다.
주요 전투에서 대패한 프랑스
사실 프랑스는 잔 다르크가 등장하는 1429년까지 긴 세월 동안 영국군에 질질 끌려다녔다. 저자는 영국군 지휘관의 탁월한 전술과 효율적인 병력운용, 그리고 사거리가 길고 파괴력이 큰 '장궁'과 같은 비교우위의 무기들을 최대한 활용한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묘사한다.
백년전쟁 초기인 1346년 에드워드 3세가 군대를 이끌고 프랑스의 대군과 마주한 크레시 전투는 대표적 사례다. 전투 당일 프랑스군은 최정예 2만 명의 철갑으로 무장한 '중기병' 만으로도 영국군 전체를 압도했다. 누가 보더라도 프랑스의 완승이 예상되는 싸움이었다.
하지만 영국군에게는 사거리가 긴 장궁을 든 병사 7천여 명이 있었다. 이들이 소낙비처럼 쏘아대는 화살에 그야말로 프랑스군은 추풍낙엽 신세였다. 병력이 많다는 이점이 효율적 지휘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움직임을 둔하게 만드는 단점이 돼버렸다. 프랑스에겐 총처럼 겨눠서 쏘는 이른바 '석궁'이 있었지만, 사거리가 짧아 무용지물이었다. 프랑스의 참패였다. 푸아티에 전투(1356), 아쟁쿠르 전투(1415)에서도 병력은 프랑스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역시 대패하고 만다.

'백년전쟁'이 남긴 것은...
프랑스 땅에서 백년전쟁이 시작된 1337년. 한반도에선 황혼 무렵의 고려가 왜구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기 시작하던 때다. 이웃 섬나라에 의해 골치를 썩었던 것은 동시대 고려나 프랑스나 마찬가지였다.
전쟁 초기 프랑스는 엄청난 국부를 바탕으로 유럽의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다. 당시 영국의 인구는 프랑스의 5분의 1인 5백만 명 정도. 농업생산력은 비교할 수 없이 초라했기에 도저히 프랑스의 상대가 안 돼 보이는 약소국이었다. 지난한 전쟁에서 영국은 결과적으로 패하고 프랑스내 영토도 잃었지만, 부의 약탈을 통해 유럽의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백년전쟁 마지막 해인 1453년 카스티용 전투에서 프랑스는 대포를 도입해 영국군을 마침내 격파한다. 저자는 그러나 이후에도 끝없이 계속된 영국의 프랑스 침공야욕을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1558년 마지막 교두보였던 칼레를 상실한 뒤에도, 잉글랜드 군주들은 1802년 아미앵 화약을 맺을 때까지 계속해서 프랑스 국왕임을 자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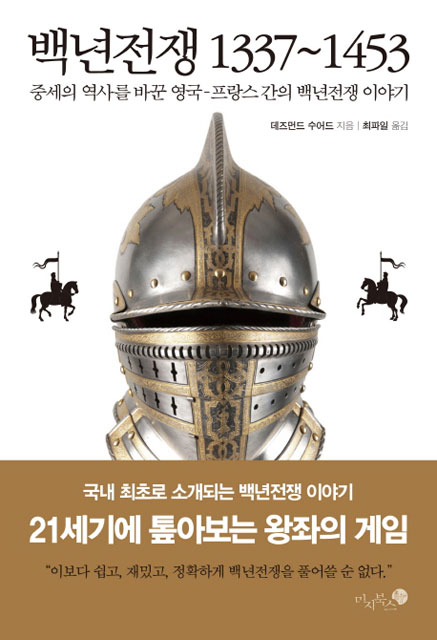
저자 데즈먼드 수어드(Desmond Seward)는 끔찍한 전란을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 근대국가 형성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백여 년에 걸친 사건들 하나하나가 사실적으로 그려지는 이유다. 때문에 회화적 묘사가 가득한 이 책을 읽으면 머릿속으로 그 참상을 그려보는 게 어렵지 않다. 삶과 죽음은 늘 공존하지만 적어도 눈앞에서 매일 목도하지 않아도 되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면서 말이다.
'영국' vs. '프랑스' 증오와 경멸감 속에 확립된 국가상
저자에겐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가 주요 관심사다. 그의 책을 읽으면 유럽에서 소위 '근대의 싹' 이 어디서 어떻게 자라나게 됐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 영국의 경우엔 아마도 '부의 약탈'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그래서인지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 전쟁 묘사는 '누가 이겼다' 정도로 쓱 보고 넘어갈 수 없게 만든다. 때문에 읽는 이로서 마냥 편하지는 않다. 피비린내 나는 전장의 살육은 물론, 탐욕스런 약탈자가 휩쓸고 간 뒤의 참상과 고통이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시기 '잔인한 약탈자'영국인들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이 전 프랑스 사회로 불길처럼 번져나갔고, 영국에서는 '먹잇감'으로 전락한 프랑스인에 대한 냉소와 경멸감이 확산했다고 본다. 저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서술한다.
"잉글랜드 지배계급은 당연히 더는 프랑스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심지어 국왕의 제1 언어도 이제는 영어가 됐다. 의심의 여지 없이 15세기 잉글랜드인과 프랑스인 사이의 적대감은 진정 민족주의적인 외국인 혐오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었다."
『백년전쟁 1337~1453』데즈먼드 수어드 지음, 최파일 옮김, 출판사 미지북스, 2018년 3월
명분은 '왕위계승'…실리는 '부의 이동'
긴 전쟁의 먹구름은 프랑스 국왕 샤를 4세가 자식 없이 사망하면서 몰려왔다. 1337년 영국 국왕 에드워드 3세가 자신의 어머니 이사벨이 샤를 4세의 누이동생인 점을 내세워 '내가 프랑스 왕이다'라고 주장하면서부터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프랑스 내 자신의 영지를 뺏길 상황에 처하자 부랴부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영국의 당돌한 군주는 불과 만 9천 명 남짓 되는 병력으로 인구 2천 5백만의 프랑스에 상륙해 긴 전쟁의 서막을 연다.
'백년전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주요 전투는 전쟁사에 빠지지 않는 '크레시 전투'를 비롯해 네다섯 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군인이 아닌 민간인을 상대로 한 약탈과 납치전쟁만큼은 그야말로 100년 내내 계속된다. 교회와 수도원 재산 약탈은 물론, 성직자들까지도 끌려가 몸값이 매겨지거나 살육의 대상이 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반면 영국에는 프랑스에서 흘러들어온 온갖 재화들이 넘치게 된다. 그야말로 부의 대이동이었던 셈이다.
주요 전투에서 대패한 프랑스
사실 프랑스는 잔 다르크가 등장하는 1429년까지 긴 세월 동안 영국군에 질질 끌려다녔다. 저자는 영국군 지휘관의 탁월한 전술과 효율적인 병력운용, 그리고 사거리가 길고 파괴력이 큰 '장궁'과 같은 비교우위의 무기들을 최대한 활용한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묘사한다.
백년전쟁 초기인 1346년 에드워드 3세가 군대를 이끌고 프랑스의 대군과 마주한 크레시 전투는 대표적 사례다. 전투 당일 프랑스군은 최정예 2만 명의 철갑으로 무장한 '중기병' 만으로도 영국군 전체를 압도했다. 누가 보더라도 프랑스의 완승이 예상되는 싸움이었다.
하지만 영국군에게는 사거리가 긴 장궁을 든 병사 7천여 명이 있었다. 이들이 소낙비처럼 쏘아대는 화살에 그야말로 프랑스군은 추풍낙엽 신세였다. 병력이 많다는 이점이 효율적 지휘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움직임을 둔하게 만드는 단점이 돼버렸다. 프랑스에겐 총처럼 겨눠서 쏘는 이른바 '석궁'이 있었지만, 사거리가 짧아 무용지물이었다. 프랑스의 참패였다. 푸아티에 전투(1356), 아쟁쿠르 전투(1415)에서도 병력은 프랑스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역시 대패하고 만다.

'백년전쟁'이 남긴 것은...
프랑스 땅에서 백년전쟁이 시작된 1337년. 한반도에선 황혼 무렵의 고려가 왜구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기 시작하던 때다. 이웃 섬나라에 의해 골치를 썩었던 것은 동시대 고려나 프랑스나 마찬가지였다.
전쟁 초기 프랑스는 엄청난 국부를 바탕으로 유럽의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다. 당시 영국의 인구는 프랑스의 5분의 1인 5백만 명 정도. 농업생산력은 비교할 수 없이 초라했기에 도저히 프랑스의 상대가 안 돼 보이는 약소국이었다. 지난한 전쟁에서 영국은 결과적으로 패하고 프랑스내 영토도 잃었지만, 부의 약탈을 통해 유럽의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백년전쟁 마지막 해인 1453년 카스티용 전투에서 프랑스는 대포를 도입해 영국군을 마침내 격파한다. 저자는 그러나 이후에도 끝없이 계속된 영국의 프랑스 침공야욕을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1558년 마지막 교두보였던 칼레를 상실한 뒤에도, 잉글랜드 군주들은 1802년 아미앵 화약을 맺을 때까지 계속해서 프랑스 국왕임을 자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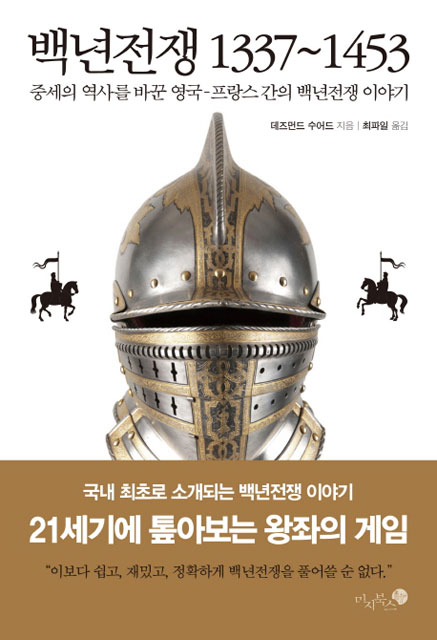
저자 데즈먼드 수어드(Desmond Seward)는 끔찍한 전란을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 근대국가 형성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백여 년에 걸친 사건들 하나하나가 사실적으로 그려지는 이유다. 때문에 회화적 묘사가 가득한 이 책을 읽으면 머릿속으로 그 참상을 그려보는 게 어렵지 않다. 삶과 죽음은 늘 공존하지만 적어도 눈앞에서 매일 목도하지 않아도 되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면서 말이다.
'영국' vs. '프랑스' 증오와 경멸감 속에 확립된 국가상
저자에겐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가 주요 관심사다. 그의 책을 읽으면 유럽에서 소위 '근대의 싹' 이 어디서 어떻게 자라나게 됐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 영국의 경우엔 아마도 '부의 약탈'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그래서인지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 전쟁 묘사는 '누가 이겼다' 정도로 쓱 보고 넘어갈 수 없게 만든다. 때문에 읽는 이로서 마냥 편하지는 않다. 피비린내 나는 전장의 살육은 물론, 탐욕스런 약탈자가 휩쓸고 간 뒤의 참상과 고통이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시기 '잔인한 약탈자'영국인들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이 전 프랑스 사회로 불길처럼 번져나갔고, 영국에서는 '먹잇감'으로 전락한 프랑스인에 대한 냉소와 경멸감이 확산했다고 본다. 저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서술한다.
"잉글랜드 지배계급은 당연히 더는 프랑스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심지어 국왕의 제1 언어도 이제는 영어가 됐다. 의심의 여지 없이 15세기 잉글랜드인과 프랑스인 사이의 적대감은 진정 민족주의적인 외국인 혐오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었다."
『백년전쟁 1337~1453』데즈먼드 수어드 지음, 최파일 옮김, 출판사 미지북스, 2018년 3월
-
-

금철영 기자 cykum@kbs.co.kr
금철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