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표류하는 브렉시트…최대 난관 ‘백스톱’ 현장을 가다
입력 2019.03.21 (09: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국경 마을 페티고(Pettigo). 비바람이 몰아친 지난 16일, 취재진은 북아일랜드 수도 벨파스트에서 서쪽으로 150km 떨어진 이 한적한 시골 마을을 찾았다. 주민들은 한결같이 궂은 날씨만큼이나 뒤숭숭한 심정을 토로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가 단행되면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사이에 국경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경 통제는 단순한 통행상의 불편을 넘어 두 나라 사이의 뿌리 깊은 적대감을 되살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영국과 EU 모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다른 나라지만 한 마을…자유로운 왕래
페티고는 1922년 아일랜드가 381년 동안의 영국 지배에서 벗어나 자치권을 획득한 이후 한 마을이 둘로 나뉜 유일한 마을이다. 마을을 관통하는 터몬 강을 경계로 국경이 그어지다 보니 마을 동쪽은 북아일랜드, 서쪽은 아일랜드 영토가 됐다.
마을은 둘로 나뉘었지만, 주민들은 현재 별다른 제한 없이 국경을 오간다. 길이 10여 미터의 작은 다리를 건너 출퇴근을 하고 장을 보러 간다. 차량들도 별다른 제한 없이 국경을 넘나든다. 다만 북아일랜드 쪽 마을에 마일(mile)로 돼 있는 속도 제한 표기가 다리 하나를 건너 아일랜드 쪽으로 가면 킬로미터(km)로 바뀌는 점만이 다르다. 아무리 봐도 국경 표기나 시설은 눈에 띄지 않는다.
두 나라의 국경은 약 500km. 페티고와 같은 국경 마을에 10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3만 명이 매일 국경을 넘어 출퇴근한다. 275개 도로를 통해 월평균 185만대의 차량이 국경을 통과한다. 두 나라 모두 EU 회원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국경의 부활, 이제는 남남?
페티고 주민 마이클 맥컨더러스 씨. 브렉시트 이후 실제로 국경 통제가 현실화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페티고는 정말 불편하고 힘들어질 것이다. 집에서 불과 100야드(약 90m) 떨어진 곳에 갑자기 국경이 생기면 누가 좋아하겠나. 세관도 생기도 경찰도 돌아다닐 것이다. 영국 정부는 상황도 모르고 결정하고 우리는 거기에 영향받고 말이 안 된다." 맥컨더러스 씨의 말이다.
맥컨더러스 씨 집 인근엔 허름한 빈 건물이 있다. 20여 년 전까지 세관이었던 건물이다. 만일 브렉시트 이후 국경 통제가 강화되면 이런 세관과 함께 군경이 지키는 검문소가 부활할 수 있다. 사람은 검문을, 상품은 통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생활의 불편은 물론 생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마을에서 30년째 우체국을 겸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60살 제임스 갤러거 씨는 "이미 브렉시트 논의 이후 파운드화가 떨어져 매출이 20% 감소했다"며 "하드 보더가 생기면 교통량이 줄기 때문에 더 많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두려운 건 따로…'피의 역사' 부활
그런데 갤러거 씨가 정말 두려운 건 따로 있다. 바로 영국과 아일랜드 간 '피의 역사'가 재발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다. 갤러거 씨 집안은 1920년대 할아버지 때부터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해왔다. 이 마을에서 나고 자라 마을 사정에 밝다. "언젠가 마을 북쪽 우체국에 폭탄이 설치돼 영국군이 제거하러 들어갔는데 폭발해 군인이 죽고 건물도 부서졌다. 또 많은 주민이 총에 맞아 죽었다. 아직도 선명하게 떠오른다." 갤러거 씨의 아픈 기억이다.
영국과 아일랜드 갈등의 역사는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541년 아일랜드를 침략한 영국 왕 헨리 8세는 현재의 북아일랜드 지역에 신교도들을 대거 이주시켰다. 이후 가톨릭 구교도인 아일랜드 원주민들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1921년 아일랜드가 대영제국내 자치령으로 독립할 때 영국계 신교도가 다수인 북아일랜드 6개 주는 영국에 남는 길을 택했다. 남부 26개 주만 아일랜드 영토가 됐고, 1949년 아일랜드가 완전 독립하면서 현재의 국경이 확정됐다.
구교도와 신교도의 해묵은 갈등은 1960년대 후반부터는 유혈 사태로 폭발했다. 특히 1972년 1월 영국 공수부대가 구교도 시위대에게 발포해 14명이 숨지는 '피의 일요일' 사건이 벌어졌다. 6개월 후 아일랜드공화국군 IRA는 폭탄 테러로 9명을 숨지게 한 '피의 금요일' 사태로 보복했다. 유혈 사태는 1998년 영국과 아일랜드가 '성 금요일 협정'으로 불리는 벨파스트 협정을 맺을 때까지 이어졌다. 북아일랜드 수도 벨파스트와 국경지역 시설물이 주요 공격 대상이 됐다.
최대 난관 '안전장치(백스톱)'…해소되지 않은 논쟁
이 같은 피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영국과 유럽연합은 지난해 11월 브렉시트 협정을 맺으면서 안전장치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른바 '백스톱(backstop)'이라 불리는 이 조항은, '하드 보더' 즉 강력한 국경 통제를 피하기 위해 2020년 말까지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을 EU의 관세동맹에 남게 해 현재처럼 자유로운 통행·통관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때까지 새 무역협정을 맺지 못하면 영국의 관세동맹 잔류는 계속될 수 있다.
영국 보수당 강경파는 바로 이 점에 강력히 반발한다. 백스톱 조항에 발목이 잡혀 영국이 영원히 유럽연합에 남을 수 있다며, 그럴 거면 390억 파운드(약 57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혼합의금'을 지불하고 왜 EU를 탈퇴하느냐는 것이다. 보수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의 리 레이놀즈 정책국장은 "우리의 가장 큰 불만은 백스톱"이라고 힘줘 말했다. "백스톱은 한번 시작되면 다시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큰 위험이 있다. 북아일랜드를 영국에서 분리시켜 영국 단일시장을 분열시킬 것이다. 배드 딜보다는 노 딜이 낫다." 레이놀즈 국장의 주장이다.
북아일랜드의 야당 신페인은 민주연합당의 주장을 강력히 반박한다. "나는 벨파스트 마을에서 자랐는데 전쟁의 악몽이었다. 30년 간 전쟁을 겪은 국경 주민과 벨파스트 주민 모두 분열과 장벽의 시절로 돌아가기 싫다고 얘기한다. 그 위협은 실제이고, 우리는 그 위협에 맞서야 한다. 좋은 브렉시트는 없지만, 백스톱은 우리의 많은 권리와 평화를 지켜줄 것이다." 매어친 뮐레어 신페인 의원의 말이다.

'평화의 벽' '희생자 벽화'가 말해주는 것
벨파스트 시내를 가다 보면 곳곳에서 '평화의 벽'을 볼 수 있다. 말이 좋아 평화의 벽이지 사실은 가톨릭 구교도와 신교도 거주지역을 분리한 장벽이다. 가장 긴 장벽은 길이가 5km, 높이는 최대 8m에 이른다. 출입문은 낮에만 열리고 밤에는 폐쇄되는데 경찰이 지키기도 한다. 1969년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설치한 장벽이 오늘까지 존재하는 것이다.
시내 거리엔 벽화도 많다. 구교도와 신교도 무장조직이 자신의 투쟁 역사를 강조하는 내용과 함께, 상대의 공격에 의해 숨진 희생자들의 얼굴을 그린 벽화들이다. 평화 협정이 체결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양측간 갈등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불씨를 안고 있는 셈이다.
이달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시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브렉시트의 향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합의 탈퇴는 이미 불가능해졌다. 합의 없는 탈퇴인 '노 딜' 브렉시트인지, 연기인지, 아니면 취소인지…표류하는 브렉시트를 향해 '피의 역사' 재발만은 절대 안 된다고 평화의 벽과 벽화는 소리 없이 외치고 있다.
다른 나라지만 한 마을…자유로운 왕래
페티고는 1922년 아일랜드가 381년 동안의 영국 지배에서 벗어나 자치권을 획득한 이후 한 마을이 둘로 나뉜 유일한 마을이다. 마을을 관통하는 터몬 강을 경계로 국경이 그어지다 보니 마을 동쪽은 북아일랜드, 서쪽은 아일랜드 영토가 됐다.
마을은 둘로 나뉘었지만, 주민들은 현재 별다른 제한 없이 국경을 오간다. 길이 10여 미터의 작은 다리를 건너 출퇴근을 하고 장을 보러 간다. 차량들도 별다른 제한 없이 국경을 넘나든다. 다만 북아일랜드 쪽 마을에 마일(mile)로 돼 있는 속도 제한 표기가 다리 하나를 건너 아일랜드 쪽으로 가면 킬로미터(km)로 바뀌는 점만이 다르다. 아무리 봐도 국경 표기나 시설은 눈에 띄지 않는다.
두 나라의 국경은 약 500km. 페티고와 같은 국경 마을에 10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3만 명이 매일 국경을 넘어 출퇴근한다. 275개 도로를 통해 월평균 185만대의 차량이 국경을 통과한다. 두 나라 모두 EU 회원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국경의 부활, 이제는 남남?
페티고 주민 마이클 맥컨더러스 씨. 브렉시트 이후 실제로 국경 통제가 현실화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페티고는 정말 불편하고 힘들어질 것이다. 집에서 불과 100야드(약 90m) 떨어진 곳에 갑자기 국경이 생기면 누가 좋아하겠나. 세관도 생기도 경찰도 돌아다닐 것이다. 영국 정부는 상황도 모르고 결정하고 우리는 거기에 영향받고 말이 안 된다." 맥컨더러스 씨의 말이다.
맥컨더러스 씨 집 인근엔 허름한 빈 건물이 있다. 20여 년 전까지 세관이었던 건물이다. 만일 브렉시트 이후 국경 통제가 강화되면 이런 세관과 함께 군경이 지키는 검문소가 부활할 수 있다. 사람은 검문을, 상품은 통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생활의 불편은 물론 생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마을에서 30년째 우체국을 겸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60살 제임스 갤러거 씨는 "이미 브렉시트 논의 이후 파운드화가 떨어져 매출이 20% 감소했다"며 "하드 보더가 생기면 교통량이 줄기 때문에 더 많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두려운 건 따로…'피의 역사' 부활
그런데 갤러거 씨가 정말 두려운 건 따로 있다. 바로 영국과 아일랜드 간 '피의 역사'가 재발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다. 갤러거 씨 집안은 1920년대 할아버지 때부터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해왔다. 이 마을에서 나고 자라 마을 사정에 밝다. "언젠가 마을 북쪽 우체국에 폭탄이 설치돼 영국군이 제거하러 들어갔는데 폭발해 군인이 죽고 건물도 부서졌다. 또 많은 주민이 총에 맞아 죽었다. 아직도 선명하게 떠오른다." 갤러거 씨의 아픈 기억이다.
영국과 아일랜드 갈등의 역사는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541년 아일랜드를 침략한 영국 왕 헨리 8세는 현재의 북아일랜드 지역에 신교도들을 대거 이주시켰다. 이후 가톨릭 구교도인 아일랜드 원주민들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1921년 아일랜드가 대영제국내 자치령으로 독립할 때 영국계 신교도가 다수인 북아일랜드 6개 주는 영국에 남는 길을 택했다. 남부 26개 주만 아일랜드 영토가 됐고, 1949년 아일랜드가 완전 독립하면서 현재의 국경이 확정됐다.
구교도와 신교도의 해묵은 갈등은 1960년대 후반부터는 유혈 사태로 폭발했다. 특히 1972년 1월 영국 공수부대가 구교도 시위대에게 발포해 14명이 숨지는 '피의 일요일' 사건이 벌어졌다. 6개월 후 아일랜드공화국군 IRA는 폭탄 테러로 9명을 숨지게 한 '피의 금요일' 사태로 보복했다. 유혈 사태는 1998년 영국과 아일랜드가 '성 금요일 협정'으로 불리는 벨파스트 협정을 맺을 때까지 이어졌다. 북아일랜드 수도 벨파스트와 국경지역 시설물이 주요 공격 대상이 됐다.
최대 난관 '안전장치(백스톱)'…해소되지 않은 논쟁
이 같은 피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영국과 유럽연합은 지난해 11월 브렉시트 협정을 맺으면서 안전장치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른바 '백스톱(backstop)'이라 불리는 이 조항은, '하드 보더' 즉 강력한 국경 통제를 피하기 위해 2020년 말까지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을 EU의 관세동맹에 남게 해 현재처럼 자유로운 통행·통관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때까지 새 무역협정을 맺지 못하면 영국의 관세동맹 잔류는 계속될 수 있다.
영국 보수당 강경파는 바로 이 점에 강력히 반발한다. 백스톱 조항에 발목이 잡혀 영국이 영원히 유럽연합에 남을 수 있다며, 그럴 거면 390억 파운드(약 57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혼합의금'을 지불하고 왜 EU를 탈퇴하느냐는 것이다. 보수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의 리 레이놀즈 정책국장은 "우리의 가장 큰 불만은 백스톱"이라고 힘줘 말했다. "백스톱은 한번 시작되면 다시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큰 위험이 있다. 북아일랜드를 영국에서 분리시켜 영국 단일시장을 분열시킬 것이다. 배드 딜보다는 노 딜이 낫다." 레이놀즈 국장의 주장이다.
북아일랜드의 야당 신페인은 민주연합당의 주장을 강력히 반박한다. "나는 벨파스트 마을에서 자랐는데 전쟁의 악몽이었다. 30년 간 전쟁을 겪은 국경 주민과 벨파스트 주민 모두 분열과 장벽의 시절로 돌아가기 싫다고 얘기한다. 그 위협은 실제이고, 우리는 그 위협에 맞서야 한다. 좋은 브렉시트는 없지만, 백스톱은 우리의 많은 권리와 평화를 지켜줄 것이다." 매어친 뮐레어 신페인 의원의 말이다.

'평화의 벽' '희생자 벽화'가 말해주는 것
벨파스트 시내를 가다 보면 곳곳에서 '평화의 벽'을 볼 수 있다. 말이 좋아 평화의 벽이지 사실은 가톨릭 구교도와 신교도 거주지역을 분리한 장벽이다. 가장 긴 장벽은 길이가 5km, 높이는 최대 8m에 이른다. 출입문은 낮에만 열리고 밤에는 폐쇄되는데 경찰이 지키기도 한다. 1969년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설치한 장벽이 오늘까지 존재하는 것이다.
시내 거리엔 벽화도 많다. 구교도와 신교도 무장조직이 자신의 투쟁 역사를 강조하는 내용과 함께, 상대의 공격에 의해 숨진 희생자들의 얼굴을 그린 벽화들이다. 평화 협정이 체결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양측간 갈등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불씨를 안고 있는 셈이다.
이달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시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브렉시트의 향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합의 탈퇴는 이미 불가능해졌다. 합의 없는 탈퇴인 '노 딜' 브렉시트인지, 연기인지, 아니면 취소인지…표류하는 브렉시트를 향해 '피의 역사' 재발만은 절대 안 된다고 평화의 벽과 벽화는 소리 없이 외치고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특파원리포트] 표류하는 브렉시트…최대 난관 ‘백스톱’ 현장을 가다
-
- 입력 2019-03-21 09:10:16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국경 마을 페티고(Pettigo). 비바람이 몰아친 지난 16일, 취재진은 북아일랜드 수도 벨파스트에서 서쪽으로 150km 떨어진 이 한적한 시골 마을을 찾았다. 주민들은 한결같이 궂은 날씨만큼이나 뒤숭숭한 심정을 토로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가 단행되면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사이에 국경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경 통제는 단순한 통행상의 불편을 넘어 두 나라 사이의 뿌리 깊은 적대감을 되살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영국과 EU 모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다른 나라지만 한 마을…자유로운 왕래
페티고는 1922년 아일랜드가 381년 동안의 영국 지배에서 벗어나 자치권을 획득한 이후 한 마을이 둘로 나뉜 유일한 마을이다. 마을을 관통하는 터몬 강을 경계로 국경이 그어지다 보니 마을 동쪽은 북아일랜드, 서쪽은 아일랜드 영토가 됐다.
마을은 둘로 나뉘었지만, 주민들은 현재 별다른 제한 없이 국경을 오간다. 길이 10여 미터의 작은 다리를 건너 출퇴근을 하고 장을 보러 간다. 차량들도 별다른 제한 없이 국경을 넘나든다. 다만 북아일랜드 쪽 마을에 마일(mile)로 돼 있는 속도 제한 표기가 다리 하나를 건너 아일랜드 쪽으로 가면 킬로미터(km)로 바뀌는 점만이 다르다. 아무리 봐도 국경 표기나 시설은 눈에 띄지 않는다.
두 나라의 국경은 약 500km. 페티고와 같은 국경 마을에 10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3만 명이 매일 국경을 넘어 출퇴근한다. 275개 도로를 통해 월평균 185만대의 차량이 국경을 통과한다. 두 나라 모두 EU 회원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국경의 부활, 이제는 남남?
페티고 주민 마이클 맥컨더러스 씨. 브렉시트 이후 실제로 국경 통제가 현실화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페티고는 정말 불편하고 힘들어질 것이다. 집에서 불과 100야드(약 90m) 떨어진 곳에 갑자기 국경이 생기면 누가 좋아하겠나. 세관도 생기도 경찰도 돌아다닐 것이다. 영국 정부는 상황도 모르고 결정하고 우리는 거기에 영향받고 말이 안 된다." 맥컨더러스 씨의 말이다.
맥컨더러스 씨 집 인근엔 허름한 빈 건물이 있다. 20여 년 전까지 세관이었던 건물이다. 만일 브렉시트 이후 국경 통제가 강화되면 이런 세관과 함께 군경이 지키는 검문소가 부활할 수 있다. 사람은 검문을, 상품은 통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생활의 불편은 물론 생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마을에서 30년째 우체국을 겸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60살 제임스 갤러거 씨는 "이미 브렉시트 논의 이후 파운드화가 떨어져 매출이 20% 감소했다"며 "하드 보더가 생기면 교통량이 줄기 때문에 더 많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두려운 건 따로…'피의 역사' 부활
그런데 갤러거 씨가 정말 두려운 건 따로 있다. 바로 영국과 아일랜드 간 '피의 역사'가 재발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다. 갤러거 씨 집안은 1920년대 할아버지 때부터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해왔다. 이 마을에서 나고 자라 마을 사정에 밝다. "언젠가 마을 북쪽 우체국에 폭탄이 설치돼 영국군이 제거하러 들어갔는데 폭발해 군인이 죽고 건물도 부서졌다. 또 많은 주민이 총에 맞아 죽었다. 아직도 선명하게 떠오른다." 갤러거 씨의 아픈 기억이다.
영국과 아일랜드 갈등의 역사는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541년 아일랜드를 침략한 영국 왕 헨리 8세는 현재의 북아일랜드 지역에 신교도들을 대거 이주시켰다. 이후 가톨릭 구교도인 아일랜드 원주민들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1921년 아일랜드가 대영제국내 자치령으로 독립할 때 영국계 신교도가 다수인 북아일랜드 6개 주는 영국에 남는 길을 택했다. 남부 26개 주만 아일랜드 영토가 됐고, 1949년 아일랜드가 완전 독립하면서 현재의 국경이 확정됐다.
구교도와 신교도의 해묵은 갈등은 1960년대 후반부터는 유혈 사태로 폭발했다. 특히 1972년 1월 영국 공수부대가 구교도 시위대에게 발포해 14명이 숨지는 '피의 일요일' 사건이 벌어졌다. 6개월 후 아일랜드공화국군 IRA는 폭탄 테러로 9명을 숨지게 한 '피의 금요일' 사태로 보복했다. 유혈 사태는 1998년 영국과 아일랜드가 '성 금요일 협정'으로 불리는 벨파스트 협정을 맺을 때까지 이어졌다. 북아일랜드 수도 벨파스트와 국경지역 시설물이 주요 공격 대상이 됐다.
최대 난관 '안전장치(백스톱)'…해소되지 않은 논쟁
이 같은 피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영국과 유럽연합은 지난해 11월 브렉시트 협정을 맺으면서 안전장치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른바 '백스톱(backstop)'이라 불리는 이 조항은, '하드 보더' 즉 강력한 국경 통제를 피하기 위해 2020년 말까지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을 EU의 관세동맹에 남게 해 현재처럼 자유로운 통행·통관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때까지 새 무역협정을 맺지 못하면 영국의 관세동맹 잔류는 계속될 수 있다.
영국 보수당 강경파는 바로 이 점에 강력히 반발한다. 백스톱 조항에 발목이 잡혀 영국이 영원히 유럽연합에 남을 수 있다며, 그럴 거면 390억 파운드(약 57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혼합의금'을 지불하고 왜 EU를 탈퇴하느냐는 것이다. 보수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의 리 레이놀즈 정책국장은 "우리의 가장 큰 불만은 백스톱"이라고 힘줘 말했다. "백스톱은 한번 시작되면 다시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큰 위험이 있다. 북아일랜드를 영국에서 분리시켜 영국 단일시장을 분열시킬 것이다. 배드 딜보다는 노 딜이 낫다." 레이놀즈 국장의 주장이다.
북아일랜드의 야당 신페인은 민주연합당의 주장을 강력히 반박한다. "나는 벨파스트 마을에서 자랐는데 전쟁의 악몽이었다. 30년 간 전쟁을 겪은 국경 주민과 벨파스트 주민 모두 분열과 장벽의 시절로 돌아가기 싫다고 얘기한다. 그 위협은 실제이고, 우리는 그 위협에 맞서야 한다. 좋은 브렉시트는 없지만, 백스톱은 우리의 많은 권리와 평화를 지켜줄 것이다." 매어친 뮐레어 신페인 의원의 말이다.

'평화의 벽' '희생자 벽화'가 말해주는 것
벨파스트 시내를 가다 보면 곳곳에서 '평화의 벽'을 볼 수 있다. 말이 좋아 평화의 벽이지 사실은 가톨릭 구교도와 신교도 거주지역을 분리한 장벽이다. 가장 긴 장벽은 길이가 5km, 높이는 최대 8m에 이른다. 출입문은 낮에만 열리고 밤에는 폐쇄되는데 경찰이 지키기도 한다. 1969년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설치한 장벽이 오늘까지 존재하는 것이다.
시내 거리엔 벽화도 많다. 구교도와 신교도 무장조직이 자신의 투쟁 역사를 강조하는 내용과 함께, 상대의 공격에 의해 숨진 희생자들의 얼굴을 그린 벽화들이다. 평화 협정이 체결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양측간 갈등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불씨를 안고 있는 셈이다.
이달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시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브렉시트의 향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합의 탈퇴는 이미 불가능해졌다. 합의 없는 탈퇴인 '노 딜' 브렉시트인지, 연기인지, 아니면 취소인지…표류하는 브렉시트를 향해 '피의 역사' 재발만은 절대 안 된다고 평화의 벽과 벽화는 소리 없이 외치고 있다.
다른 나라지만 한 마을…자유로운 왕래
페티고는 1922년 아일랜드가 381년 동안의 영국 지배에서 벗어나 자치권을 획득한 이후 한 마을이 둘로 나뉜 유일한 마을이다. 마을을 관통하는 터몬 강을 경계로 국경이 그어지다 보니 마을 동쪽은 북아일랜드, 서쪽은 아일랜드 영토가 됐다.
마을은 둘로 나뉘었지만, 주민들은 현재 별다른 제한 없이 국경을 오간다. 길이 10여 미터의 작은 다리를 건너 출퇴근을 하고 장을 보러 간다. 차량들도 별다른 제한 없이 국경을 넘나든다. 다만 북아일랜드 쪽 마을에 마일(mile)로 돼 있는 속도 제한 표기가 다리 하나를 건너 아일랜드 쪽으로 가면 킬로미터(km)로 바뀌는 점만이 다르다. 아무리 봐도 국경 표기나 시설은 눈에 띄지 않는다.
두 나라의 국경은 약 500km. 페티고와 같은 국경 마을에 10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3만 명이 매일 국경을 넘어 출퇴근한다. 275개 도로를 통해 월평균 185만대의 차량이 국경을 통과한다. 두 나라 모두 EU 회원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국경의 부활, 이제는 남남?
페티고 주민 마이클 맥컨더러스 씨. 브렉시트 이후 실제로 국경 통제가 현실화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페티고는 정말 불편하고 힘들어질 것이다. 집에서 불과 100야드(약 90m) 떨어진 곳에 갑자기 국경이 생기면 누가 좋아하겠나. 세관도 생기도 경찰도 돌아다닐 것이다. 영국 정부는 상황도 모르고 결정하고 우리는 거기에 영향받고 말이 안 된다." 맥컨더러스 씨의 말이다.
맥컨더러스 씨 집 인근엔 허름한 빈 건물이 있다. 20여 년 전까지 세관이었던 건물이다. 만일 브렉시트 이후 국경 통제가 강화되면 이런 세관과 함께 군경이 지키는 검문소가 부활할 수 있다. 사람은 검문을, 상품은 통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생활의 불편은 물론 생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마을에서 30년째 우체국을 겸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60살 제임스 갤러거 씨는 "이미 브렉시트 논의 이후 파운드화가 떨어져 매출이 20% 감소했다"며 "하드 보더가 생기면 교통량이 줄기 때문에 더 많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두려운 건 따로…'피의 역사' 부활
그런데 갤러거 씨가 정말 두려운 건 따로 있다. 바로 영국과 아일랜드 간 '피의 역사'가 재발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다. 갤러거 씨 집안은 1920년대 할아버지 때부터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해왔다. 이 마을에서 나고 자라 마을 사정에 밝다. "언젠가 마을 북쪽 우체국에 폭탄이 설치돼 영국군이 제거하러 들어갔는데 폭발해 군인이 죽고 건물도 부서졌다. 또 많은 주민이 총에 맞아 죽었다. 아직도 선명하게 떠오른다." 갤러거 씨의 아픈 기억이다.
영국과 아일랜드 갈등의 역사는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541년 아일랜드를 침략한 영국 왕 헨리 8세는 현재의 북아일랜드 지역에 신교도들을 대거 이주시켰다. 이후 가톨릭 구교도인 아일랜드 원주민들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1921년 아일랜드가 대영제국내 자치령으로 독립할 때 영국계 신교도가 다수인 북아일랜드 6개 주는 영국에 남는 길을 택했다. 남부 26개 주만 아일랜드 영토가 됐고, 1949년 아일랜드가 완전 독립하면서 현재의 국경이 확정됐다.
구교도와 신교도의 해묵은 갈등은 1960년대 후반부터는 유혈 사태로 폭발했다. 특히 1972년 1월 영국 공수부대가 구교도 시위대에게 발포해 14명이 숨지는 '피의 일요일' 사건이 벌어졌다. 6개월 후 아일랜드공화국군 IRA는 폭탄 테러로 9명을 숨지게 한 '피의 금요일' 사태로 보복했다. 유혈 사태는 1998년 영국과 아일랜드가 '성 금요일 협정'으로 불리는 벨파스트 협정을 맺을 때까지 이어졌다. 북아일랜드 수도 벨파스트와 국경지역 시설물이 주요 공격 대상이 됐다.
최대 난관 '안전장치(백스톱)'…해소되지 않은 논쟁
이 같은 피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영국과 유럽연합은 지난해 11월 브렉시트 협정을 맺으면서 안전장치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른바 '백스톱(backstop)'이라 불리는 이 조항은, '하드 보더' 즉 강력한 국경 통제를 피하기 위해 2020년 말까지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을 EU의 관세동맹에 남게 해 현재처럼 자유로운 통행·통관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때까지 새 무역협정을 맺지 못하면 영국의 관세동맹 잔류는 계속될 수 있다.
영국 보수당 강경파는 바로 이 점에 강력히 반발한다. 백스톱 조항에 발목이 잡혀 영국이 영원히 유럽연합에 남을 수 있다며, 그럴 거면 390억 파운드(약 57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혼합의금'을 지불하고 왜 EU를 탈퇴하느냐는 것이다. 보수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의 리 레이놀즈 정책국장은 "우리의 가장 큰 불만은 백스톱"이라고 힘줘 말했다. "백스톱은 한번 시작되면 다시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큰 위험이 있다. 북아일랜드를 영국에서 분리시켜 영국 단일시장을 분열시킬 것이다. 배드 딜보다는 노 딜이 낫다." 레이놀즈 국장의 주장이다.
북아일랜드의 야당 신페인은 민주연합당의 주장을 강력히 반박한다. "나는 벨파스트 마을에서 자랐는데 전쟁의 악몽이었다. 30년 간 전쟁을 겪은 국경 주민과 벨파스트 주민 모두 분열과 장벽의 시절로 돌아가기 싫다고 얘기한다. 그 위협은 실제이고, 우리는 그 위협에 맞서야 한다. 좋은 브렉시트는 없지만, 백스톱은 우리의 많은 권리와 평화를 지켜줄 것이다." 매어친 뮐레어 신페인 의원의 말이다.

'평화의 벽' '희생자 벽화'가 말해주는 것
벨파스트 시내를 가다 보면 곳곳에서 '평화의 벽'을 볼 수 있다. 말이 좋아 평화의 벽이지 사실은 가톨릭 구교도와 신교도 거주지역을 분리한 장벽이다. 가장 긴 장벽은 길이가 5km, 높이는 최대 8m에 이른다. 출입문은 낮에만 열리고 밤에는 폐쇄되는데 경찰이 지키기도 한다. 1969년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설치한 장벽이 오늘까지 존재하는 것이다.
시내 거리엔 벽화도 많다. 구교도와 신교도 무장조직이 자신의 투쟁 역사를 강조하는 내용과 함께, 상대의 공격에 의해 숨진 희생자들의 얼굴을 그린 벽화들이다. 평화 협정이 체결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양측간 갈등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불씨를 안고 있는 셈이다.
이달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시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브렉시트의 향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합의 탈퇴는 이미 불가능해졌다. 합의 없는 탈퇴인 '노 딜' 브렉시트인지, 연기인지, 아니면 취소인지…표류하는 브렉시트를 향해 '피의 역사' 재발만은 절대 안 된다고 평화의 벽과 벽화는 소리 없이 외치고 있다.
-
-

유광석 기자 ksyoo@kbs.co.kr
유광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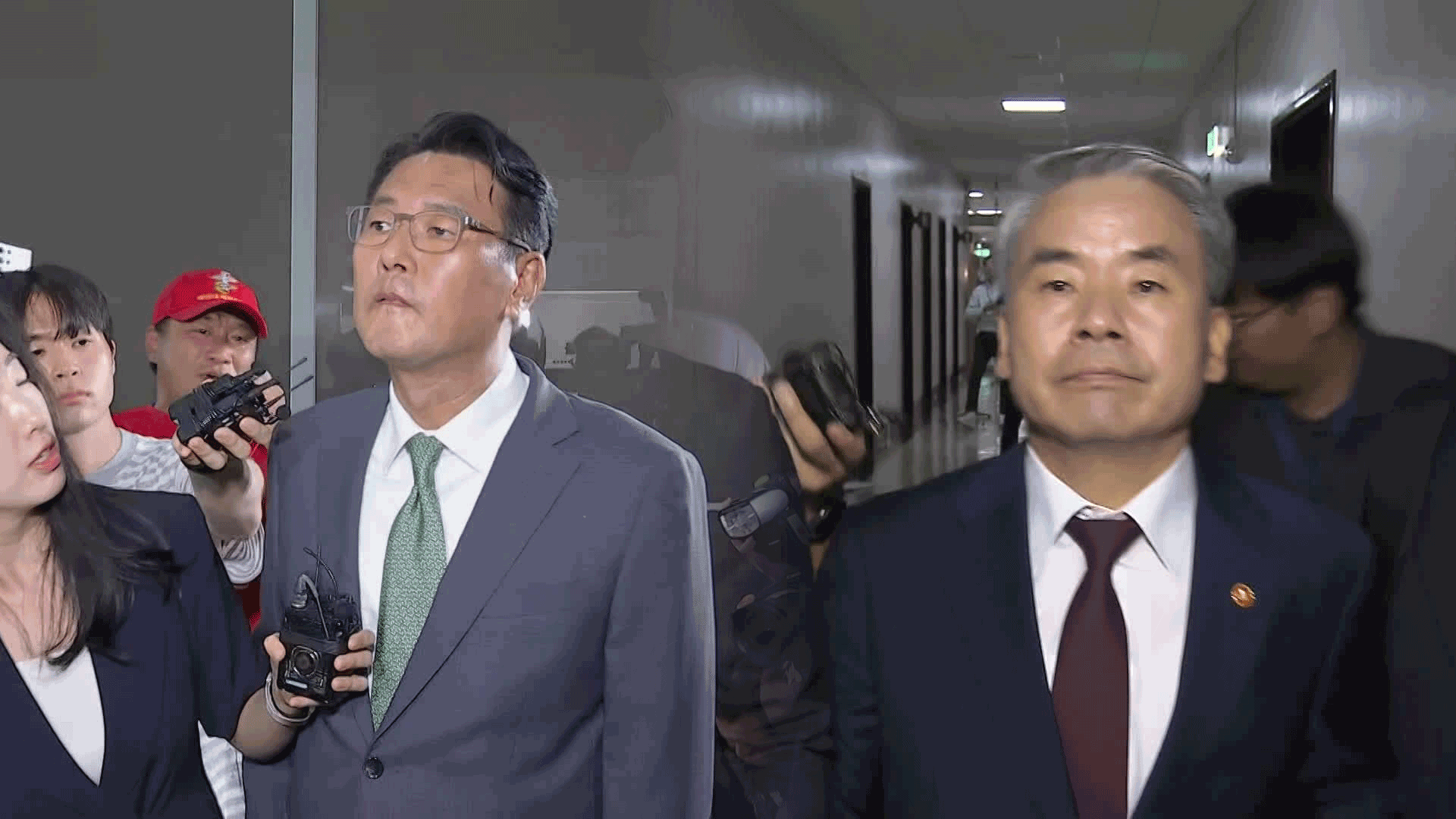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