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광화문 현판은 ‘검은 바탕-금색 글자’일까?
입력 2019.11.04 (07:00)
수정 2019.11.04 (07: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화문 현판은 묵질(墨質)에 금자(金字)이다.”
검정 바탕에 금색 글자. 광화문 현판 색상의 진실을 확인해준 문헌 기록이죠. 이 기록은 일본 와세다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경복궁 영건일기》 제3권의 1865년(고종 2년) 10월 11일 자에 등장합니다. 흰 바탕에 검정 글자인 현재의 광화문 현판의 고증이 잘못됐음을 보여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이 자료의 존재가 확인된 건 지난해였습니다. 그전까지는 이 기록 자체가 존재하는지 문화재 당국조차도 까맣게 몰랐습니다.
뒤늦게 확인한 광화문 현판 고증
고종이 즉위한 이듬해인 1865년 4월, 임금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주도 아래 대대적인 경복궁 중건(重建) 공사가 시작됩니다. 임진왜란 이후 300년 가까이 폐허로 방치됐던 조선 왕조의 법궁(法宮)을 재건하는 초대형 공사였죠. 이 과정을 날짜별로 기록한 공사 일지가 바로 《경복궁 영건일기》입니다. 경복궁 중건 과정을 알려주는 최초의 자료이자 유일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경복궁 영건일기》는 경복궁 중건 과정을 알려주는 유일한 자료다.
《경복궁 영건일기》는 경복궁 중건 과정을 알려주는 유일한 자료다.비단 광화문 현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경복궁 주요 전각과 출입문 현판은 대부분 검정 바탕에 금색 글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복궁 영건일기》제7권의 1867년(고종 4년) 4월 21일 기록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교태전(交泰殿)과 강녕전(康寧殿)의 현판은 묵본(墨本)에 금자(金字)이다. [각 전당이 모두 검은 바탕인 것은 불을 제어하는 이치를 취한 것이다.]”
불을 제어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색상 배치를 따져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금색 글자는 불입니다. 불의 색깔을 떠올려 보세요. 이 불을 검정 바탕으로 에워싸 가뒀습니다. 불을 제어하려는 뜻을 담은 거죠. 그만큼 불이 두려웠던 겁니다. 자나 깨나 불조심이었던 거죠. 오죽했으면 현판에까지 그런 의미를 담았을까요. 실제로 《경복궁 영건일기》를 보면 공사 기간 내내 크고 작은 화재가 끊임없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복궁 현판들 색 구성의 비밀은 '불조심'
공사 도중 발생한 첫 대형 화재가 1866년(고종 3년) 3월 5일 기록에 보입니다. 당시 영건도감(營建都監)과 의정부(議政府)가 임금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오늘 2경 무렵 동십자각 근처에 있는 훈련도감 화공(畵工)의 가가(假家)에서 불이 나서 나무를 다듬는가가 800여 칸과 다듬어 놓은 목재까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계속해서 불 끄는 것을 감독하고 신칙하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
“지난밤 영건하다 실화(失火)로 불에 탄 것이 수백 칸에 이를 정도로 많고, 이미 다듬어 놓은 재목도 대부분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밤 영건하다 실화(失火)로 불에 탄 것이 수백 칸에 이를 정도로 많고, 이미 다듬어 놓은 재목도 대부분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가 상당했던 겁니다. 이날 당직 책임자는 훈련대장 임태영(任泰瑛)이었습니다. 임태영은 당시 광화문 건설 책임자로 광화문 현판 글씨를 쓴 주인공이기도 하죠. 의정부에서는 화재를 진압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당직 책임자를 파면하고 병사들을 유배 보내겠다고 임금에게 보고합니다. 임태영 자신도 책임지고 사직하겠다는 상소를 올리고요. 하지만 고종은 임태영과 병사들을 용서해줍니다. 화재 예방에 더 힘쓰라는 명령과 함께 말이죠.
불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걱정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경복궁 영건일기》의 1866년(고종 3년) 1월 6일 자에 이런 내용이 보입니다.
“패장[훈교(訓校) 정응현(鄭應賢)]을 관악산 정상에 보냈다. 당일 사시(巳時)에 나무를 베어 숯을 만들었는데, 산꼭대기의 자방(子方)에 솥을 두고 숯을 구워 6섬을 얻었다. 이달 26일 사시에 근정전의 술해방(戌亥方)과 경회루지의 북쪽 제방 위에 감괘(坎卦) 모양처럼 땅을 파고 숯을 묻어 관악산의 화기(火氣)를 줄이는데 사용하였다.”
관악산이 품은 불의 기운을 줄이기 위해 나무를 베어다 숯을 만들어 경복궁에 땅을 파고 묻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관악산 정상에 우물까지 팝니다. 불을 다스리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죠. 관악산의 불 기운에 대한 언급은 또 있습니다. 1866년(고종 3년) 7월 1일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경회루지의) 수구(水口)는 처음에는 서쪽으로 냈다. 남쪽 제방을 쌓을 때 제방의 두둑을 다지면서 옛 수구를 발견하였는데 남변(南邊)에 조금 가까웠다. 옛사람들이 관악산의 화성(火星)의 성질을 제어하려고 그렇게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옛 방식대로 수구를 냈다.”
경회루 연못의 물구멍을 서쪽으로 내고 보니 옛 구멍은 남쪽에 가깝더라, 그래서 옛 모습대로 물구멍을 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관악산이 품은 불의 성질을 제어하기 위해서일 거라고 본 거죠. 관악산이 품은 불의 기운에 대해서는 조선 건국 시기의 유명한 야사가 전해옵니다.
곳곳에 남아 있는 불에 대한 두려움의 기록
경복궁을 창건할 때 어느 방향을 보도록 해야 하느냐를 놓고 정도전과 무학대사가 논쟁을 벌입니다. 무학대사는 한양의 진산을 인왕산으로 잡고 임금이 동쪽을 바라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도전은 제왕이 남쪽을 향해 앉아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맞서죠. 결국 정도전의 주장이 받아들여 지자 무학대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200년이 지나 반드시 내 말을 생각할 때가 있을 것이다."
 경복궁 근정전
경복궁 근정전여기서 무학대사가 우려했던 것이 바로 관악산의 화기(火氣)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200년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경복궁이 깡그리 불에 타버리자, 무학대사가 남긴 불길한 예언이 맞아떨어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떠돈 겁니다.
관악산 정상에 우물을 판 이듬해인 1867년의 기록에도 불의 기운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장치가 등장하는데요. 2월 19일 자 기록입니다.
“근정전의 단청이 이루어졌다. 화체(畵體)는 초룡(草龍)과 운물(雲物)에서 형상을 취하였다. [제화(制火)의 뜻을 취하였다. 경회루도 마찬가지이다.]”
근정전과 경회루에 단청을 하면서 불을 제어(制火)하는 뜻을 담았다는 뜻입니다. 누구말마따나 정말 눈물 겨울 정도로 자나 깨나 불 걱정입니다. 우리 옛 건축물은 나무로 지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땔감을 가져다 불을 때는 온돌식 난방을 했기 때문에 늘 불쏘시개를 안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경복궁 중건 공사 기간에도 조정에서는 '불조심'하라는 지시를 거듭거듭 내립니다.
그럼에도 잊을 만하면 다시 타오르는 불길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던가 봅니다. 경복궁 중건 공사 기간에 일어난 가장 큰 화재는 1867년(고종 4년) 2월 9일 기록에서 확인됩니다. 훈련도감의 보고 내용입니다.
“오늘 유시(酉時) 무렵에 본 도감 별간역(別看役)이 있는 곳과 원역소(員役所), 그리고 나무를 다듬는 가가(假家)와 다듬어 놓은 목재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이어지는 영건도감의 보고는 훨씬 자세합니다.
“이날 마침 서북풍이 거세게 불었다. 별간역 처소에서 시작되었는데 수직군(守直軍)들이 저녁 무렵 불을 냈다. 불은 영추문에서 건춘문 안 전고(錢庫), 잡물고까지 번졌고, 수많은 가가에 저축해 두었던 사정전 남쪽 행각 및 각사를 짓는 데 쓸 재목까지도 모두 태워버렸다. 건춘문 남쪽으로 20여 칸의 거리에 있던 성연(城椽)도 불에 탔다. 대개 여러 겹겹으로 천여 칸이나 되고 볏짚의 가건물인 데다가 불과 바람이 맹렬하였으니, 비록 불끄는 도구가 있어도 어찌 가까이 가서 불을 끌 방도가 있었겠는가? 다만 전각에 불이 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다. 하지만 이후 건설하는 것은 다시 새로 재목을 베어 써야 하는 지경이 되었으니, 참으로 걱정스러워 애가 탄다.”
경복궁 중건의 대역사와 백성들의 고난도 기록
전각까지 불이 옮겨붙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었지만 이 화재로 인해 경복궁 중건 공사에 쓸 상당량의 목재가 잿더미로 변하고 맙니다. 이날 이후의 기록을 보면 가뜩이나 부족한 공사용 목재를 구하기 위해 노심초사했던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워낙에 대대적인 공사이다 보니 모든 물자가 부족했고, 특히 쓸만한 나무를 구하는 일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경복궁 영건일기》를 읽다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나무 찾아 삼만리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올 6월 서울역사편찬원이 펴낸 《국역 경복궁 영건일기》
올 6월 서울역사편찬원이 펴낸 《국역 경복궁 영건일기》《경복궁 영건일기》는 당시 영건도감에 근무했던 한 관리가 작성한 조선 정부의 공식 기록물입니다. 철저하게 정부의 관점을 담고 있죠. 하지만 장장 3년 3개월에 걸친 경복궁 중건의 대역사에는 공사에 동원된 이름 없는 장인들과 병사들, 백성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응어리져 있습니다. 이 방대한 문헌을 읽어내려가면서 새삼스럽게 든 생각입니다. 《국역 경복궁 영건일기》는 올해 6월 서울역사편찬원이 펴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왜 광화문 현판은 ‘검은 바탕-금색 글자’일까?
-
- 입력 2019-11-04 07:00:22
- 수정2019-11-04 07:01:47

“광화문 현판은 묵질(墨質)에 금자(金字)이다.”
검정 바탕에 금색 글자. 광화문 현판 색상의 진실을 확인해준 문헌 기록이죠. 이 기록은 일본 와세다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경복궁 영건일기》 제3권의 1865년(고종 2년) 10월 11일 자에 등장합니다. 흰 바탕에 검정 글자인 현재의 광화문 현판의 고증이 잘못됐음을 보여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이 자료의 존재가 확인된 건 지난해였습니다. 그전까지는 이 기록 자체가 존재하는지 문화재 당국조차도 까맣게 몰랐습니다.
뒤늦게 확인한 광화문 현판 고증
고종이 즉위한 이듬해인 1865년 4월, 임금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주도 아래 대대적인 경복궁 중건(重建) 공사가 시작됩니다. 임진왜란 이후 300년 가까이 폐허로 방치됐던 조선 왕조의 법궁(法宮)을 재건하는 초대형 공사였죠. 이 과정을 날짜별로 기록한 공사 일지가 바로 《경복궁 영건일기》입니다. 경복궁 중건 과정을 알려주는 최초의 자료이자 유일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비단 광화문 현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경복궁 주요 전각과 출입문 현판은 대부분 검정 바탕에 금색 글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복궁 영건일기》제7권의 1867년(고종 4년) 4월 21일 기록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교태전(交泰殿)과 강녕전(康寧殿)의 현판은 묵본(墨本)에 금자(金字)이다. [각 전당이 모두 검은 바탕인 것은 불을 제어하는 이치를 취한 것이다.]”
불을 제어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색상 배치를 따져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금색 글자는 불입니다. 불의 색깔을 떠올려 보세요. 이 불을 검정 바탕으로 에워싸 가뒀습니다. 불을 제어하려는 뜻을 담은 거죠. 그만큼 불이 두려웠던 겁니다. 자나 깨나 불조심이었던 거죠. 오죽했으면 현판에까지 그런 의미를 담았을까요. 실제로 《경복궁 영건일기》를 보면 공사 기간 내내 크고 작은 화재가 끊임없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복궁 현판들 색 구성의 비밀은 '불조심'
공사 도중 발생한 첫 대형 화재가 1866년(고종 3년) 3월 5일 기록에 보입니다. 당시 영건도감(營建都監)과 의정부(議政府)가 임금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오늘 2경 무렵 동십자각 근처에 있는 훈련도감 화공(畵工)의 가가(假家)에서 불이 나서 나무를 다듬는가가 800여 칸과 다듬어 놓은 목재까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계속해서 불 끄는 것을 감독하고 신칙하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
“지난밤 영건하다 실화(失火)로 불에 탄 것이 수백 칸에 이를 정도로 많고, 이미 다듬어 놓은 재목도 대부분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밤 영건하다 실화(失火)로 불에 탄 것이 수백 칸에 이를 정도로 많고, 이미 다듬어 놓은 재목도 대부분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가 상당했던 겁니다. 이날 당직 책임자는 훈련대장 임태영(任泰瑛)이었습니다. 임태영은 당시 광화문 건설 책임자로 광화문 현판 글씨를 쓴 주인공이기도 하죠. 의정부에서는 화재를 진압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당직 책임자를 파면하고 병사들을 유배 보내겠다고 임금에게 보고합니다. 임태영 자신도 책임지고 사직하겠다는 상소를 올리고요. 하지만 고종은 임태영과 병사들을 용서해줍니다. 화재 예방에 더 힘쓰라는 명령과 함께 말이죠.
불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걱정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경복궁 영건일기》의 1866년(고종 3년) 1월 6일 자에 이런 내용이 보입니다.
“패장[훈교(訓校) 정응현(鄭應賢)]을 관악산 정상에 보냈다. 당일 사시(巳時)에 나무를 베어 숯을 만들었는데, 산꼭대기의 자방(子方)에 솥을 두고 숯을 구워 6섬을 얻었다. 이달 26일 사시에 근정전의 술해방(戌亥方)과 경회루지의 북쪽 제방 위에 감괘(坎卦) 모양처럼 땅을 파고 숯을 묻어 관악산의 화기(火氣)를 줄이는데 사용하였다.”
관악산이 품은 불의 기운을 줄이기 위해 나무를 베어다 숯을 만들어 경복궁에 땅을 파고 묻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관악산 정상에 우물까지 팝니다. 불을 다스리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죠. 관악산의 불 기운에 대한 언급은 또 있습니다. 1866년(고종 3년) 7월 1일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경회루지의) 수구(水口)는 처음에는 서쪽으로 냈다. 남쪽 제방을 쌓을 때 제방의 두둑을 다지면서 옛 수구를 발견하였는데 남변(南邊)에 조금 가까웠다. 옛사람들이 관악산의 화성(火星)의 성질을 제어하려고 그렇게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옛 방식대로 수구를 냈다.”
경회루 연못의 물구멍을 서쪽으로 내고 보니 옛 구멍은 남쪽에 가깝더라, 그래서 옛 모습대로 물구멍을 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관악산이 품은 불의 성질을 제어하기 위해서일 거라고 본 거죠. 관악산이 품은 불의 기운에 대해서는 조선 건국 시기의 유명한 야사가 전해옵니다.
곳곳에 남아 있는 불에 대한 두려움의 기록
경복궁을 창건할 때 어느 방향을 보도록 해야 하느냐를 놓고 정도전과 무학대사가 논쟁을 벌입니다. 무학대사는 한양의 진산을 인왕산으로 잡고 임금이 동쪽을 바라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도전은 제왕이 남쪽을 향해 앉아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맞서죠. 결국 정도전의 주장이 받아들여 지자 무학대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200년이 지나 반드시 내 말을 생각할 때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무학대사가 우려했던 것이 바로 관악산의 화기(火氣)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200년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경복궁이 깡그리 불에 타버리자, 무학대사가 남긴 불길한 예언이 맞아떨어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떠돈 겁니다.
관악산 정상에 우물을 판 이듬해인 1867년의 기록에도 불의 기운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장치가 등장하는데요. 2월 19일 자 기록입니다.
“근정전의 단청이 이루어졌다. 화체(畵體)는 초룡(草龍)과 운물(雲物)에서 형상을 취하였다. [제화(制火)의 뜻을 취하였다. 경회루도 마찬가지이다.]”
근정전과 경회루에 단청을 하면서 불을 제어(制火)하는 뜻을 담았다는 뜻입니다. 누구말마따나 정말 눈물 겨울 정도로 자나 깨나 불 걱정입니다. 우리 옛 건축물은 나무로 지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땔감을 가져다 불을 때는 온돌식 난방을 했기 때문에 늘 불쏘시개를 안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경복궁 중건 공사 기간에도 조정에서는 '불조심'하라는 지시를 거듭거듭 내립니다.
그럼에도 잊을 만하면 다시 타오르는 불길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던가 봅니다. 경복궁 중건 공사 기간에 일어난 가장 큰 화재는 1867년(고종 4년) 2월 9일 기록에서 확인됩니다. 훈련도감의 보고 내용입니다.
“오늘 유시(酉時) 무렵에 본 도감 별간역(別看役)이 있는 곳과 원역소(員役所), 그리고 나무를 다듬는 가가(假家)와 다듬어 놓은 목재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이어지는 영건도감의 보고는 훨씬 자세합니다.
“이날 마침 서북풍이 거세게 불었다. 별간역 처소에서 시작되었는데 수직군(守直軍)들이 저녁 무렵 불을 냈다. 불은 영추문에서 건춘문 안 전고(錢庫), 잡물고까지 번졌고, 수많은 가가에 저축해 두었던 사정전 남쪽 행각 및 각사를 짓는 데 쓸 재목까지도 모두 태워버렸다. 건춘문 남쪽으로 20여 칸의 거리에 있던 성연(城椽)도 불에 탔다. 대개 여러 겹겹으로 천여 칸이나 되고 볏짚의 가건물인 데다가 불과 바람이 맹렬하였으니, 비록 불끄는 도구가 있어도 어찌 가까이 가서 불을 끌 방도가 있었겠는가? 다만 전각에 불이 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다. 하지만 이후 건설하는 것은 다시 새로 재목을 베어 써야 하는 지경이 되었으니, 참으로 걱정스러워 애가 탄다.”
경복궁 중건의 대역사와 백성들의 고난도 기록
전각까지 불이 옮겨붙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었지만 이 화재로 인해 경복궁 중건 공사에 쓸 상당량의 목재가 잿더미로 변하고 맙니다. 이날 이후의 기록을 보면 가뜩이나 부족한 공사용 목재를 구하기 위해 노심초사했던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워낙에 대대적인 공사이다 보니 모든 물자가 부족했고, 특히 쓸만한 나무를 구하는 일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경복궁 영건일기》를 읽다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나무 찾아 삼만리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경복궁 영건일기》는 당시 영건도감에 근무했던 한 관리가 작성한 조선 정부의 공식 기록물입니다. 철저하게 정부의 관점을 담고 있죠. 하지만 장장 3년 3개월에 걸친 경복궁 중건의 대역사에는 공사에 동원된 이름 없는 장인들과 병사들, 백성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응어리져 있습니다. 이 방대한 문헌을 읽어내려가면서 새삼스럽게 든 생각입니다. 《국역 경복궁 영건일기》는 올해 6월 서울역사편찬원이 펴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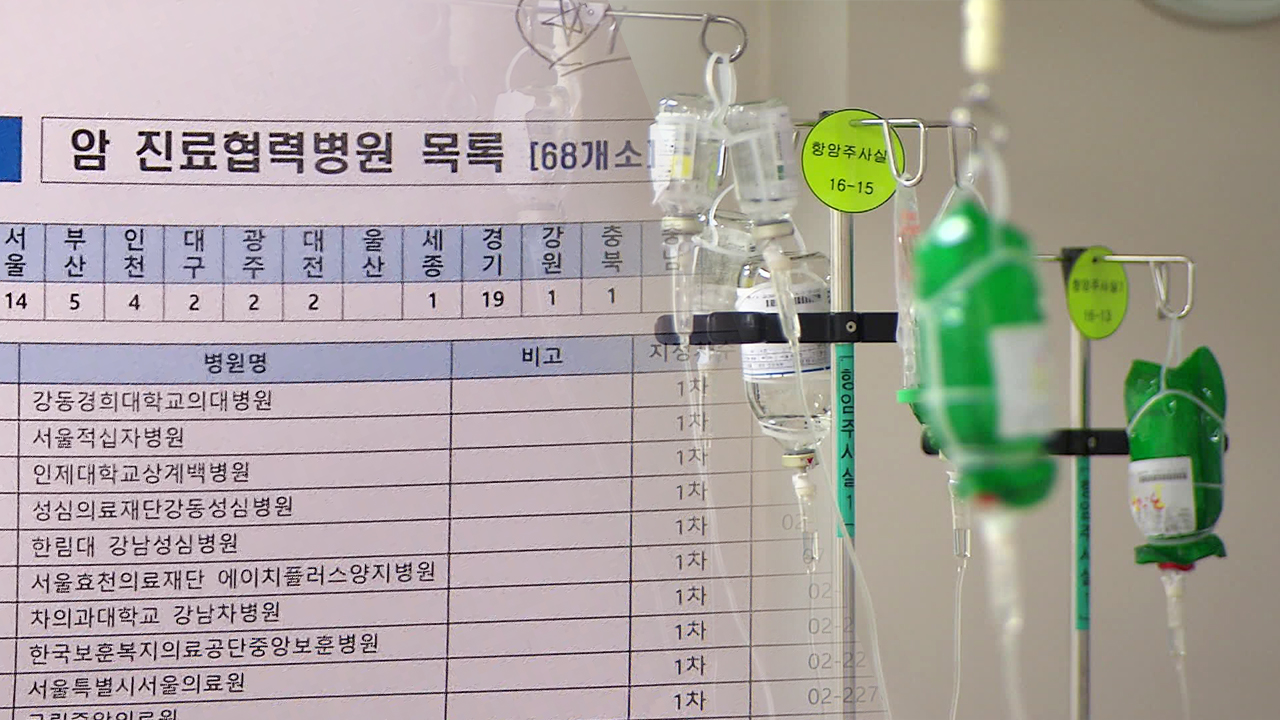

![[단독] “쿵쿵거리지 마” 이웃에 가스총 발사 난동 60대 체포](/data/layer/904/2024/04/20240426_kEfhp6.jpg)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