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00] 20대 국회 청년 러브콜과 ‘청년 의안’ 1.4%
입력 2020.01.06 (13:59)
수정 2020.01.06 (13: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도 많은 청년이 발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청년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만들지 못합니다. 청년들이 청년의 얼굴로 정치적 목소리를 낼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선권에 있는 공천도 받지 못하고, 주요 보직에도 앉지 못합니다."
작가로 활동했던 29살 정다연 녹색당 비례대표 예비후보자가 당내 경선에 나선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답한 말입니다. 그는 이어 "20대 의원 0명, 30대 의원 2명인 지금 국회가 청년을 대변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청년 세대는 정치권에서 과소 대표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말이 타당한지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인구에서 청년 비율은 얼마나 될지 살펴봤습니다. 언뜻 전체 인구수에서 20·30세대를 나누면 쉽게 비율을 구할 수 있을 거 같지만 사실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선 청년이란 정의가 제각각의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입법부에서는 100석이 넘는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경우 45살을 기준으로 청년을 나누고 있습니다. 반면 행정부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15살 이상 29살 이하를 청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 역시 청년 나이를 다르게 판단할 때도 있는데 미취업 청년의 고용 문제에 관해서는 만 34살로 청년 나이를 늘리기도 합니다.
앞의 기준(15살 이상 29살 이하)을 따르면 청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8%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만약 뒷 기준(15세 이상 34살 이하)을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4명 가운데 1명은 청년이 됩니다.

대표적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청년 비중을 확인해봤습니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 구성 비중은 국민의 나이 별 구성 비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대 국회의원의 평균 나이는 약 55살입니다. 대한민국 평균 나이인 41살, 대한민국 중위 나이인 42살보다 각각 14살, 13살 더 많습니다. 더구나 20대 국회에서 40대 미만의 국회의원은 단 3명이었습니다.
심지어 20대 국회에서 40대 미만 국회의원은 단 2명 선출됐다가 지난해 10월에서야 30대 의원이 비례 대표를 승계해 3명이 됐습니다. 20대 총선 당시 투표권이 있던 19살과 20대, 30대 인구는 유권자 3명 가운데 1명꼴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가 청년 세대 대변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55살 국회가 청년 세대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민주당 대선 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대 국회의 실제 입법 활동은 어땠을까요?

20대 국회에서 발의 또는 제출된 안건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6일) 기준으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의안은 모두 2만 4,684개입니다. 이 가운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청년'을 제시한, 즉 청년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의안은 모두 344개입니다. 전체 의안에서 1.4%도 안 되는 비중입니다. 참고로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전체 유권자의 약 35%가 20대와 30대였습니다.
그나마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며 의안이 제기됐을 때 주목받다가 흐지부지된 경우도 흔합니다. 청년기본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청년 첫 일자리지원특별법, 청년세법안 등 청년 맞춤 정책이라고 소개됐던 다양한 의안들이 국회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의 경우 지난 2016년 5월 20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새누리당 1호 법안이기도 했습니다. 또 유사한 법안도 10개가 있으며 지난 2018년 여야 합의까지 이뤄냈지만,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법 적용 대상인 1,100만 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일자리, 주거, 복지 지원 등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6년 6월에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청년 공공주택을 지원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제기됐지만, 빛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졸업 뒤 빠른 취직을 위한 수당 등의 지원을 명시한 청년 첫 일자리지원특별법 역시 비슷한 처지입니다.

오늘(6일)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100일 앞둔 날입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또다시 청년들에게 청년 공천과 청년 정책, 청년 공약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청년이 정치 이벤트의 대상이 아니라 당당한 목소리를 내는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작가로 활동했던 29살 정다연 녹색당 비례대표 예비후보자가 당내 경선에 나선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답한 말입니다. 그는 이어 "20대 의원 0명, 30대 의원 2명인 지금 국회가 청년을 대변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청년 세대는 정치권에서 과소 대표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말이 타당한지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인구에서 청년 비율은 얼마나 될지 살펴봤습니다. 언뜻 전체 인구수에서 20·30세대를 나누면 쉽게 비율을 구할 수 있을 거 같지만 사실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선 청년이란 정의가 제각각의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입법부에서는 100석이 넘는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경우 45살을 기준으로 청년을 나누고 있습니다. 반면 행정부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15살 이상 29살 이하를 청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 역시 청년 나이를 다르게 판단할 때도 있는데 미취업 청년의 고용 문제에 관해서는 만 34살로 청년 나이를 늘리기도 합니다.
앞의 기준(15살 이상 29살 이하)을 따르면 청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8%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만약 뒷 기준(15세 이상 34살 이하)을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4명 가운데 1명은 청년이 됩니다.

대표적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청년 비중을 확인해봤습니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 구성 비중은 국민의 나이 별 구성 비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대 국회의원의 평균 나이는 약 55살입니다. 대한민국 평균 나이인 41살, 대한민국 중위 나이인 42살보다 각각 14살, 13살 더 많습니다. 더구나 20대 국회에서 40대 미만의 국회의원은 단 3명이었습니다.
심지어 20대 국회에서 40대 미만 국회의원은 단 2명 선출됐다가 지난해 10월에서야 30대 의원이 비례 대표를 승계해 3명이 됐습니다. 20대 총선 당시 투표권이 있던 19살과 20대, 30대 인구는 유권자 3명 가운데 1명꼴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가 청년 세대 대변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55살 국회가 청년 세대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민주당 대선 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대 국회의 실제 입법 활동은 어땠을까요?

20대 국회에서 발의 또는 제출된 안건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6일) 기준으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의안은 모두 2만 4,684개입니다. 이 가운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청년'을 제시한, 즉 청년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의안은 모두 344개입니다. 전체 의안에서 1.4%도 안 되는 비중입니다. 참고로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전체 유권자의 약 35%가 20대와 30대였습니다.
그나마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며 의안이 제기됐을 때 주목받다가 흐지부지된 경우도 흔합니다. 청년기본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청년 첫 일자리지원특별법, 청년세법안 등 청년 맞춤 정책이라고 소개됐던 다양한 의안들이 국회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의 경우 지난 2016년 5월 20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새누리당 1호 법안이기도 했습니다. 또 유사한 법안도 10개가 있으며 지난 2018년 여야 합의까지 이뤄냈지만,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법 적용 대상인 1,100만 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일자리, 주거, 복지 지원 등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6년 6월에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청년 공공주택을 지원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제기됐지만, 빛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졸업 뒤 빠른 취직을 위한 수당 등의 지원을 명시한 청년 첫 일자리지원특별법 역시 비슷한 처지입니다.

오늘(6일)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100일 앞둔 날입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또다시 청년들에게 청년 공천과 청년 정책, 청년 공약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청년이 정치 이벤트의 대상이 아니라 당당한 목소리를 내는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총선 D-100] 20대 국회 청년 러브콜과 ‘청년 의안’ 1.4%
-
- 입력 2020-01-06 13:59:45
- 수정2020-01-06 13:59:55

"현재 정치권에서도 많은 청년이 발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청년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만들지 못합니다. 청년들이 청년의 얼굴로 정치적 목소리를 낼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선권에 있는 공천도 받지 못하고, 주요 보직에도 앉지 못합니다."
작가로 활동했던 29살 정다연 녹색당 비례대표 예비후보자가 당내 경선에 나선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답한 말입니다. 그는 이어 "20대 의원 0명, 30대 의원 2명인 지금 국회가 청년을 대변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청년 세대는 정치권에서 과소 대표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말이 타당한지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인구에서 청년 비율은 얼마나 될지 살펴봤습니다. 언뜻 전체 인구수에서 20·30세대를 나누면 쉽게 비율을 구할 수 있을 거 같지만 사실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선 청년이란 정의가 제각각의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입법부에서는 100석이 넘는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경우 45살을 기준으로 청년을 나누고 있습니다. 반면 행정부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15살 이상 29살 이하를 청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 역시 청년 나이를 다르게 판단할 때도 있는데 미취업 청년의 고용 문제에 관해서는 만 34살로 청년 나이를 늘리기도 합니다.
앞의 기준(15살 이상 29살 이하)을 따르면 청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8%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만약 뒷 기준(15세 이상 34살 이하)을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4명 가운데 1명은 청년이 됩니다.

대표적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청년 비중을 확인해봤습니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 구성 비중은 국민의 나이 별 구성 비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대 국회의원의 평균 나이는 약 55살입니다. 대한민국 평균 나이인 41살, 대한민국 중위 나이인 42살보다 각각 14살, 13살 더 많습니다. 더구나 20대 국회에서 40대 미만의 국회의원은 단 3명이었습니다.
심지어 20대 국회에서 40대 미만 국회의원은 단 2명 선출됐다가 지난해 10월에서야 30대 의원이 비례 대표를 승계해 3명이 됐습니다. 20대 총선 당시 투표권이 있던 19살과 20대, 30대 인구는 유권자 3명 가운데 1명꼴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가 청년 세대 대변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55살 국회가 청년 세대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민주당 대선 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대 국회의 실제 입법 활동은 어땠을까요?

20대 국회에서 발의 또는 제출된 안건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6일) 기준으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의안은 모두 2만 4,684개입니다. 이 가운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청년'을 제시한, 즉 청년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의안은 모두 344개입니다. 전체 의안에서 1.4%도 안 되는 비중입니다. 참고로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전체 유권자의 약 35%가 20대와 30대였습니다.
그나마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며 의안이 제기됐을 때 주목받다가 흐지부지된 경우도 흔합니다. 청년기본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청년 첫 일자리지원특별법, 청년세법안 등 청년 맞춤 정책이라고 소개됐던 다양한 의안들이 국회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의 경우 지난 2016년 5월 20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새누리당 1호 법안이기도 했습니다. 또 유사한 법안도 10개가 있으며 지난 2018년 여야 합의까지 이뤄냈지만,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법 적용 대상인 1,100만 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일자리, 주거, 복지 지원 등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6년 6월에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청년 공공주택을 지원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제기됐지만, 빛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졸업 뒤 빠른 취직을 위한 수당 등의 지원을 명시한 청년 첫 일자리지원특별법 역시 비슷한 처지입니다.

오늘(6일)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100일 앞둔 날입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또다시 청년들에게 청년 공천과 청년 정책, 청년 공약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청년이 정치 이벤트의 대상이 아니라 당당한 목소리를 내는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작가로 활동했던 29살 정다연 녹색당 비례대표 예비후보자가 당내 경선에 나선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답한 말입니다. 그는 이어 "20대 의원 0명, 30대 의원 2명인 지금 국회가 청년을 대변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청년 세대는 정치권에서 과소 대표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말이 타당한지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인구에서 청년 비율은 얼마나 될지 살펴봤습니다. 언뜻 전체 인구수에서 20·30세대를 나누면 쉽게 비율을 구할 수 있을 거 같지만 사실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선 청년이란 정의가 제각각의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입법부에서는 100석이 넘는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경우 45살을 기준으로 청년을 나누고 있습니다. 반면 행정부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15살 이상 29살 이하를 청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 역시 청년 나이를 다르게 판단할 때도 있는데 미취업 청년의 고용 문제에 관해서는 만 34살로 청년 나이를 늘리기도 합니다.
앞의 기준(15살 이상 29살 이하)을 따르면 청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8%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만약 뒷 기준(15세 이상 34살 이하)을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4명 가운데 1명은 청년이 됩니다.

대표적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청년 비중을 확인해봤습니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 구성 비중은 국민의 나이 별 구성 비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대 국회의원의 평균 나이는 약 55살입니다. 대한민국 평균 나이인 41살, 대한민국 중위 나이인 42살보다 각각 14살, 13살 더 많습니다. 더구나 20대 국회에서 40대 미만의 국회의원은 단 3명이었습니다.
심지어 20대 국회에서 40대 미만 국회의원은 단 2명 선출됐다가 지난해 10월에서야 30대 의원이 비례 대표를 승계해 3명이 됐습니다. 20대 총선 당시 투표권이 있던 19살과 20대, 30대 인구는 유권자 3명 가운데 1명꼴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가 청년 세대 대변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55살 국회가 청년 세대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민주당 대선 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대 국회의 실제 입법 활동은 어땠을까요?

20대 국회에서 발의 또는 제출된 안건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6일) 기준으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의안은 모두 2만 4,684개입니다. 이 가운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청년'을 제시한, 즉 청년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의안은 모두 344개입니다. 전체 의안에서 1.4%도 안 되는 비중입니다. 참고로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전체 유권자의 약 35%가 20대와 30대였습니다.
그나마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며 의안이 제기됐을 때 주목받다가 흐지부지된 경우도 흔합니다. 청년기본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청년 첫 일자리지원특별법, 청년세법안 등 청년 맞춤 정책이라고 소개됐던 다양한 의안들이 국회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의 경우 지난 2016년 5월 20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새누리당 1호 법안이기도 했습니다. 또 유사한 법안도 10개가 있으며 지난 2018년 여야 합의까지 이뤄냈지만,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법 적용 대상인 1,100만 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일자리, 주거, 복지 지원 등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6년 6월에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청년 공공주택을 지원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제기됐지만, 빛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졸업 뒤 빠른 취직을 위한 수당 등의 지원을 명시한 청년 첫 일자리지원특별법 역시 비슷한 처지입니다.

오늘(6일)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100일 앞둔 날입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또다시 청년들에게 청년 공천과 청년 정책, 청년 공약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청년이 정치 이벤트의 대상이 아니라 당당한 목소리를 내는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
-

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전현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21대 국회의원 선거










![[영상] 한자리에 모인 슈퍼여당 초선들…선거운동도?](/data/news/2020/04/28/4434264_5VA.jpg)
![[국회감시K] 재산신고 92억 원 당선인…비결은 명의신탁?](/data/news/2020/04/27/4434022_16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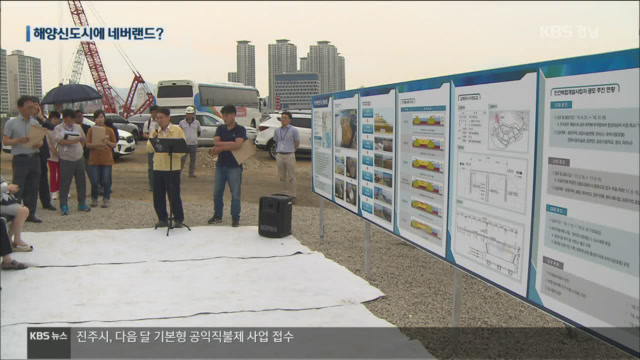
![[속보] 경찰, ‘31명 사상’ 화성 화재 관련 아리셀 <br>압수수색](/data/layer/904/2024/06/20240626_jInk8y.jpg)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