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까지 내몰린 천연기념물 ‘황조롱이’의 수난
입력 2020.09.10 (05:03)
수정 2020.09.14 (13: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황조롱이 ‘천연기념물 323-8호’
■ '잦은 호우·태풍'에 탈진…천연기념물 황조롱이도 '수난'
지난 3일 저녁, 충북 음성의 한 아파트 15층 복도에서 새끼 황조롱이가 발견됐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간 직후입니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당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소방 구조대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자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7월 말에는 KBS 청주방송총국 뒷마당에서까지 다친 황조롱이가 발견돼 구조됐습니다. 건물에 부딪혀 척추가 부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처가 심해 황조롱이는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황조롱이가 KBS 청주방송총국 뒷마당에서도 발견됐다.
황조롱이가 KBS 청주방송총국 뒷마당에서도 발견됐다.
기후 변화로 인한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 호우, 태풍으로 고충을 겪는 건 천연기념물 황조롱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 바람을 피해 건물 안으로 날아들기도 합니다. 태풍으로 먹잇감 찾기도 쉽지 않아 탈진 상태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바람에 휩쓸려 다치기도 합니다.
543. 지난해 전국 야생동물센터·치료센터, 동물병원 등으로 실려 온 황조롱이의 숫자입니다. 2018년 452마리보다 91마리가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구조된 황조롱이는 453마리입니다.
 황조롱이가 다친 머리를 치료받고 있다.
황조롱이가 다친 머리를 치료받고 있다.
 황조롱이가 부러진 다리를 치료받고 있다.
황조롱이가 부러진 다리를 치료받고 있다.
■ 고도 100m 미만의 '삶의 터전'…인간과 공생을 선택한 '황조롱이'
1982년 천연기념물 323-8호로 지정된 황조롱이는 전국적으로 관찰이 쉬운 전형적인 텃새입니다. 매 과에 속하는 소형 맹금류입니다. 주로 쥐 등 설치류나 벌레 등을 잡아먹는데 하천의 흙벽이나 암벽의 오목한 곳에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조류는 먹잇감이 많은 곳으로 서식 반경을 잡는 특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활권과 밀접한 설치류가 황조롱이의 먹잇감이니 우리는 사실상 같이 사는 셈이죠.
지난해, 국립생태원과 국립생활자원관 등이 환경부의 '전국자연환경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천연기념물 제323-8호 황조롱이의 최근 10년('08~'17) 분포 특성>을 공동 연구했습니다. 여기에서 황조롱이는 인간의 터전인 고도 100m 미만에서 주로 출현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도시에서 산꼭대기까지 13개의 고도 범위 중 가장 낮은 지점인 거죠.
■ 잦은 부상, 미아 신세…'황조롱이' 이사하는 날
황조롱이는 인간의 주거 지역에서 적응력이 뛰어난 맹금류라고 알려졌지만,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투명한 유리 창문에 충돌하고, 건물과 차량에 부딪히고, 쥐 끈끈이에 다치는 등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비행 능력이 떨어지는 새끼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미를 놓쳐 미아가 되기도 합니다.
동물보호단체는 다치거나 고립된 황조롱이를 발견하는 즉시, 119나 각 시·군 문화재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맹금류인 만큼, 섣불리 만지거나 구조하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황조롱이를 방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
황조롱이를 방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
 황조롱이가 방사돼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다.
황조롱이가 방사돼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다.
■ 다시 돌아오는 천연기념물…"킷, 킷, 킷"
황조롱이의 울음소리입니다. 치료를 받은 뒤 건강을 회복해 자연으로 돌려보낸 황조롱이 대부분은 머지않아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난개발 등으로 자연 서식지가 갈수록 파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베란다, 학교 창문 난간 등에 또 살림을 차릴 겁니다.
황조롱이를 보면 최대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천연기념물 황조롱이를 보호하는 최선의 조치라고 합니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신용운 박사는 "둥지가 아슬아슬해 시설물을 받쳐주는 등 사람의 손이 닿으면 황조롱이는 둥지 틀기를 포기한다"며, "너무 자주 들여다봐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조언합니다. 사람 손이 가급적 닿지 않아야, 동물 본연의 습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3일 저녁, 충북 음성의 한 아파트 15층 복도에서 새끼 황조롱이가 발견됐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간 직후입니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당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소방 구조대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자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7월 말에는 KBS 청주방송총국 뒷마당에서까지 다친 황조롱이가 발견돼 구조됐습니다. 건물에 부딪혀 척추가 부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처가 심해 황조롱이는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황조롱이가 KBS 청주방송총국 뒷마당에서도 발견됐다.
황조롱이가 KBS 청주방송총국 뒷마당에서도 발견됐다.기후 변화로 인한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 호우, 태풍으로 고충을 겪는 건 천연기념물 황조롱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 바람을 피해 건물 안으로 날아들기도 합니다. 태풍으로 먹잇감 찾기도 쉽지 않아 탈진 상태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바람에 휩쓸려 다치기도 합니다.
543. 지난해 전국 야생동물센터·치료센터, 동물병원 등으로 실려 온 황조롱이의 숫자입니다. 2018년 452마리보다 91마리가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구조된 황조롱이는 453마리입니다.
 황조롱이가 다친 머리를 치료받고 있다.
황조롱이가 다친 머리를 치료받고 있다. 황조롱이가 부러진 다리를 치료받고 있다.
황조롱이가 부러진 다리를 치료받고 있다.■ 고도 100m 미만의 '삶의 터전'…인간과 공생을 선택한 '황조롱이'
1982년 천연기념물 323-8호로 지정된 황조롱이는 전국적으로 관찰이 쉬운 전형적인 텃새입니다. 매 과에 속하는 소형 맹금류입니다. 주로 쥐 등 설치류나 벌레 등을 잡아먹는데 하천의 흙벽이나 암벽의 오목한 곳에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조류는 먹잇감이 많은 곳으로 서식 반경을 잡는 특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활권과 밀접한 설치류가 황조롱이의 먹잇감이니 우리는 사실상 같이 사는 셈이죠.
지난해, 국립생태원과 국립생활자원관 등이 환경부의 '전국자연환경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천연기념물 제323-8호 황조롱이의 최근 10년('08~'17) 분포 특성>을 공동 연구했습니다. 여기에서 황조롱이는 인간의 터전인 고도 100m 미만에서 주로 출현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도시에서 산꼭대기까지 13개의 고도 범위 중 가장 낮은 지점인 거죠.
■ 잦은 부상, 미아 신세…'황조롱이' 이사하는 날
황조롱이는 인간의 주거 지역에서 적응력이 뛰어난 맹금류라고 알려졌지만,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투명한 유리 창문에 충돌하고, 건물과 차량에 부딪히고, 쥐 끈끈이에 다치는 등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비행 능력이 떨어지는 새끼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미를 놓쳐 미아가 되기도 합니다.
동물보호단체는 다치거나 고립된 황조롱이를 발견하는 즉시, 119나 각 시·군 문화재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맹금류인 만큼, 섣불리 만지거나 구조하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황조롱이를 방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
황조롱이를 방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 황조롱이가 방사돼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다.
황조롱이가 방사돼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다.■ 다시 돌아오는 천연기념물…"킷, 킷, 킷"
황조롱이의 울음소리입니다. 치료를 받은 뒤 건강을 회복해 자연으로 돌려보낸 황조롱이 대부분은 머지않아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난개발 등으로 자연 서식지가 갈수록 파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베란다, 학교 창문 난간 등에 또 살림을 차릴 겁니다.
황조롱이를 보면 최대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천연기념물 황조롱이를 보호하는 최선의 조치라고 합니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신용운 박사는 "둥지가 아슬아슬해 시설물을 받쳐주는 등 사람의 손이 닿으면 황조롱이는 둥지 틀기를 포기한다"며, "너무 자주 들여다봐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조언합니다. 사람 손이 가급적 닿지 않아야, 동물 본연의 습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도심까지 내몰린 천연기념물 ‘황조롱이’의 수난
-
- 입력 2020-09-10 05:03:24
- 수정2020-09-14 13:56:56

황조롱이 ‘천연기념물 323-8호’
■ '잦은 호우·태풍'에 탈진…천연기념물 황조롱이도 '수난'
지난 3일 저녁, 충북 음성의 한 아파트 15층 복도에서 새끼 황조롱이가 발견됐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간 직후입니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당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소방 구조대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자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7월 말에는 KBS 청주방송총국 뒷마당에서까지 다친 황조롱이가 발견돼 구조됐습니다. 건물에 부딪혀 척추가 부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처가 심해 황조롱이는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 호우, 태풍으로 고충을 겪는 건 천연기념물 황조롱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 바람을 피해 건물 안으로 날아들기도 합니다. 태풍으로 먹잇감 찾기도 쉽지 않아 탈진 상태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바람에 휩쓸려 다치기도 합니다.
543. 지난해 전국 야생동물센터·치료센터, 동물병원 등으로 실려 온 황조롱이의 숫자입니다. 2018년 452마리보다 91마리가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구조된 황조롱이는 453마리입니다.


■ 고도 100m 미만의 '삶의 터전'…인간과 공생을 선택한 '황조롱이'
1982년 천연기념물 323-8호로 지정된 황조롱이는 전국적으로 관찰이 쉬운 전형적인 텃새입니다. 매 과에 속하는 소형 맹금류입니다. 주로 쥐 등 설치류나 벌레 등을 잡아먹는데 하천의 흙벽이나 암벽의 오목한 곳에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조류는 먹잇감이 많은 곳으로 서식 반경을 잡는 특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활권과 밀접한 설치류가 황조롱이의 먹잇감이니 우리는 사실상 같이 사는 셈이죠.
지난해, 국립생태원과 국립생활자원관 등이 환경부의 '전국자연환경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천연기념물 제323-8호 황조롱이의 최근 10년('08~'17) 분포 특성>을 공동 연구했습니다. 여기에서 황조롱이는 인간의 터전인 고도 100m 미만에서 주로 출현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도시에서 산꼭대기까지 13개의 고도 범위 중 가장 낮은 지점인 거죠.
■ 잦은 부상, 미아 신세…'황조롱이' 이사하는 날
황조롱이는 인간의 주거 지역에서 적응력이 뛰어난 맹금류라고 알려졌지만,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투명한 유리 창문에 충돌하고, 건물과 차량에 부딪히고, 쥐 끈끈이에 다치는 등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비행 능력이 떨어지는 새끼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미를 놓쳐 미아가 되기도 합니다.
동물보호단체는 다치거나 고립된 황조롱이를 발견하는 즉시, 119나 각 시·군 문화재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맹금류인 만큼, 섣불리 만지거나 구조하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다시 돌아오는 천연기념물…"킷, 킷, 킷"
황조롱이의 울음소리입니다. 치료를 받은 뒤 건강을 회복해 자연으로 돌려보낸 황조롱이 대부분은 머지않아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난개발 등으로 자연 서식지가 갈수록 파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베란다, 학교 창문 난간 등에 또 살림을 차릴 겁니다.
황조롱이를 보면 최대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천연기념물 황조롱이를 보호하는 최선의 조치라고 합니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신용운 박사는 "둥지가 아슬아슬해 시설물을 받쳐주는 등 사람의 손이 닿으면 황조롱이는 둥지 틀기를 포기한다"며, "너무 자주 들여다봐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조언합니다. 사람 손이 가급적 닿지 않아야, 동물 본연의 습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3일 저녁, 충북 음성의 한 아파트 15층 복도에서 새끼 황조롱이가 발견됐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간 직후입니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당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소방 구조대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자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7월 말에는 KBS 청주방송총국 뒷마당에서까지 다친 황조롱이가 발견돼 구조됐습니다. 건물에 부딪혀 척추가 부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처가 심해 황조롱이는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 호우, 태풍으로 고충을 겪는 건 천연기념물 황조롱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 바람을 피해 건물 안으로 날아들기도 합니다. 태풍으로 먹잇감 찾기도 쉽지 않아 탈진 상태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바람에 휩쓸려 다치기도 합니다.
543. 지난해 전국 야생동물센터·치료센터, 동물병원 등으로 실려 온 황조롱이의 숫자입니다. 2018년 452마리보다 91마리가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구조된 황조롱이는 453마리입니다.


■ 고도 100m 미만의 '삶의 터전'…인간과 공생을 선택한 '황조롱이'
1982년 천연기념물 323-8호로 지정된 황조롱이는 전국적으로 관찰이 쉬운 전형적인 텃새입니다. 매 과에 속하는 소형 맹금류입니다. 주로 쥐 등 설치류나 벌레 등을 잡아먹는데 하천의 흙벽이나 암벽의 오목한 곳에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조류는 먹잇감이 많은 곳으로 서식 반경을 잡는 특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활권과 밀접한 설치류가 황조롱이의 먹잇감이니 우리는 사실상 같이 사는 셈이죠.
지난해, 국립생태원과 국립생활자원관 등이 환경부의 '전국자연환경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천연기념물 제323-8호 황조롱이의 최근 10년('08~'17) 분포 특성>을 공동 연구했습니다. 여기에서 황조롱이는 인간의 터전인 고도 100m 미만에서 주로 출현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도시에서 산꼭대기까지 13개의 고도 범위 중 가장 낮은 지점인 거죠.
■ 잦은 부상, 미아 신세…'황조롱이' 이사하는 날
황조롱이는 인간의 주거 지역에서 적응력이 뛰어난 맹금류라고 알려졌지만,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투명한 유리 창문에 충돌하고, 건물과 차량에 부딪히고, 쥐 끈끈이에 다치는 등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비행 능력이 떨어지는 새끼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미를 놓쳐 미아가 되기도 합니다.
동물보호단체는 다치거나 고립된 황조롱이를 발견하는 즉시, 119나 각 시·군 문화재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맹금류인 만큼, 섣불리 만지거나 구조하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다시 돌아오는 천연기념물…"킷, 킷, 킷"
황조롱이의 울음소리입니다. 치료를 받은 뒤 건강을 회복해 자연으로 돌려보낸 황조롱이 대부분은 머지않아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난개발 등으로 자연 서식지가 갈수록 파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베란다, 학교 창문 난간 등에 또 살림을 차릴 겁니다.
황조롱이를 보면 최대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천연기념물 황조롱이를 보호하는 최선의 조치라고 합니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신용운 박사는 "둥지가 아슬아슬해 시설물을 받쳐주는 등 사람의 손이 닿으면 황조롱이는 둥지 틀기를 포기한다"며, "너무 자주 들여다봐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조언합니다. 사람 손이 가급적 닿지 않아야, 동물 본연의 습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
-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송국회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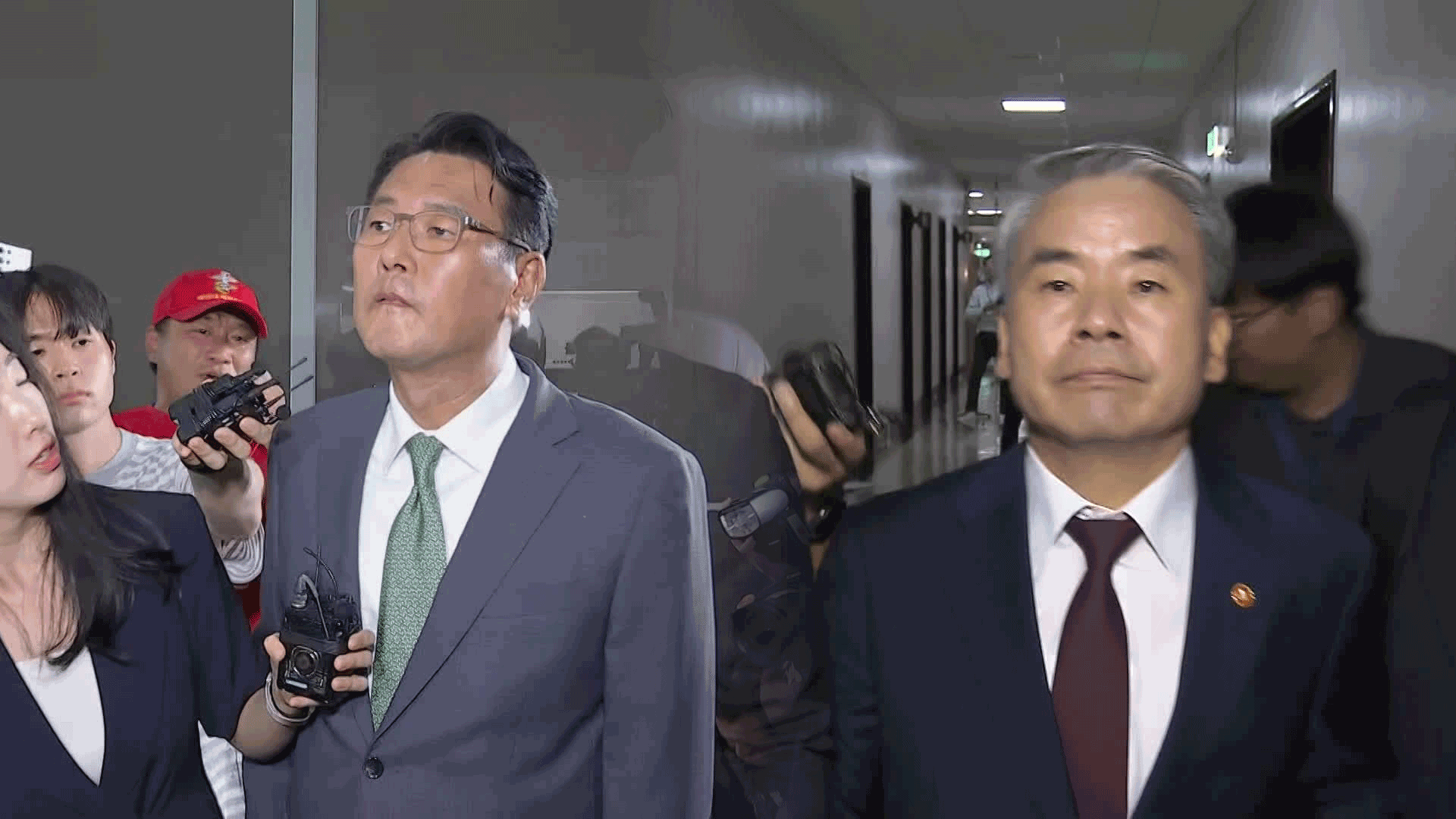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