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독일 통일 30년…냉전의 장벽이 녹색 평화지대로
입력 2020.10.02 (07: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됐다 다시 통일을 이룩한 독일은 아직 분단 상태인 한국에 늘 연구의 대상이다. 통일의 과정과 통일 전후의 변화가 한국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다. 그런 독일이 10월 3일로 통일 30주년을 맞는다.
철의 장막이 1,393km 녹색 띠로 변신
한반도의 허리를 동서로 가로지르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분단 시절 동서독 사이에도 비무장지대가 있었다. 장벽과 철책이 설치됐고, 지뢰도 매설됐다. 그런 철의 장막이 통일 이후 어떻게 됐을까? 독일은 철조망을 거둬낸 자리를 개발하는 대신 녹색지대로 변모시켰다. 독일어로 '그뤼네스 반트'(Grünes Band), 철책이 사라진 자리에 녹색 숲이 등장했다. 하늘에서 보면 발트해부터 체코 국경에 이르기까지 1,393km 구간에 녹색 띠가 이어진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하르츠 국립공원. 총면적이 25,000ha로 독일 국립공원 가운데 두 번째로 크다. 옛 동독지역인 작센-안할트주와 옛 서독지역인 니더작센주에 걸쳐 있다. 가장 높은 봉우리인 브로켄 산에서 5월 1일에 마녀들이 연회를 연다는 '발푸르기스의 밤'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기도 하다.
가문비나무가 울창한 하르츠 국립공원 안으로는 분단 시절 동서독 국경이 지났다. 일반인의 접근이 차단됐기에 동식물에 최적의 서식지가 됐다. 통일 이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숲이 보존되면서 다양한 생태 체험 구간이 조성됐다.
다양한 생태체험 탐방로 조성

화창한 날씨가 펼쳐진 9월 22일 오전 9시 무렵, 등산로 입구는 이미 방문객들로 분주했다. 하루 일정으로 브로켄 산까지 가보려 한다는 60대 부부를 만났다. 남편인 요아힘 뷔스테펠트 씨는 "자연과 새, 동물을 관찰하고 이곳에 오면 증기기관차 타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부인 클라우디아도 옆에서 "자연, 해, 초록, 향기가 매우 좋다"고 거들었다.
하르츠 국립공원 안에는 특이한 저수지도 있다. 에커강이 흘러 모인 '에커탈슈페레'란 이름의 저수지인데, 이 저수지 중간으로도 국경이 지났다. 탐방객들은 저수지 위 댐을 지나는 색다른 체험을 하는데, 과거 국경 표시를 보며 상념에 잠기기도 한다. 다니엘 씨는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본연의 모습이 남아있다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평지에서도 녹색 숲은 50~200m의 폭을 이루며 전체 1,393km 구간에 이어져 훌륭한 탐방로가 된다. 바이에른주와 튀링엔주 국경 인근 도시 미트비츠. 취재진은 울창한 숲길을 걸어오는 두 친구를 만났다. 휴가기간 3주 일정으로 그뤼네스 반트를 따라 걷고 있다고 했다. 하루 20km씩 걸은 게 10일이 지난 날이었다.
슈테파니 씨는 "풍경이 계속 바뀐다. 어느 때는 숲을 걷고 어느 때는 넓은 들판이 있고 식물과 동물도 다양하다. 뱀도 보고 독일 동화에 나오는 광대버섯도 많았다"고 그간의 소감을 밝혔다.
분단 시절 동독지역 철책 옆으론 단단한 시멘트 바닥이 만들어졌다. 당시 동독 군인들의 순찰로이자 물자 운송로였다. 30년이 지난 지금 시멘트 바닥 사이로 풀이 자라나 훌륭한 탐방로가 됐다.
이 같은 탐방로는 그뤼네스 반트 17,000여 ha 구석구석에 조성돼 있다. 특히 전체 면적의 84%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동식물 5천여 종이 서식하고 있는데 탐방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그 가운데 1,200여 종은 멸종 위기의 희귀종이어서 보존 가치가 매우 높다.
분단 역사 되새기는 역사교육장

그뤼네스 반트는 훌륭한 생태 체험 구간이면서 동시에 역사교육장 역할도 수행한다. 튀링엔주(옛 동독지역)와 바이에른주(옛 서독지역) 경계에 있는 마을 뫼들라로이트는 매우 특이한 마을이다.
주민 40여 명이 거주하는 이 마을 사이로 작은 실개천이 흐르는데 폭이 50cm 정도밖에 안 된다. 이 실개천 사이로 주 경계선이 지나는데 1945년 독일이 분단되면서 튀링엔주는 동독에, 바이에른주는 서독에 편입됐다. 특별 허가를 받아야 가능했던 마을 간 통행은 1952년부터 중단됐고, 1966년엔 아예 실개천을 따라 동독지역에 장벽과 철조망이 설치됐다. 이 때문에 이 마을은 '작은 베를린'이란 별명을 얻게 됐고, 독일 드라마의 배경 마을이 되기도 했다.
1990년 통일 이후 뫼들라로이트 마을은 분단 시절 시설물을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다. 마을에 들어서면 감시탑과 철조망, 장벽 일부가 남아 있다. 로베르트 레베게른 뫼들라로이트 박물관장은 야외 전시장과 함께 국경 지역의 일상을 볼 수 있는 전시관과 학생과 성인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설명했다. "어떤 방식, 어느 규모로 이 작은 마을을 통해 독일의 분단 역사를 후손을 위해 보존할지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방문객들은 시설물들을 찬찬히 둘러보며 분단의 상처를 더듬어 본다. 코르버 씨는 "분단이 동서독으로 나뉜 마을 양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볼 수 있다. 국경이 얼마나 폭력적인 것인지 보는 게 매우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 해 7만여 명이 마을 자체가 박물관인 이곳을 찾는다. 그뤼네스 반트 전 구간에 48개의 박물관이 있는데, 각 구간의 역사를 특색 있게 보여주고 있다.
민관 30년 협력이 생태계 보전 비결

철조망과 지뢰로 상징되던 지역이 이렇게 생태 숲으로 거듭난 건 저절로 된 게 아니었다.
취재진은 튀링엔주와 바이에른주의 경계도시 중 하나인 미트비츠에서 카이 프로벨 교수를 만났다. 환경생태학자인 프로벨 교수는 10대 후반부터 40여 년간 경계지역 생태계를 연구해 왔다. 프로벨 교수와 같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독일 환경보존협회는 그뤼네스 반트 조성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협회는 통일 이전인 1980년 초반부터 보존을 목표로 국경 지역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1989년 장벽 붕괴와 더불어 국경 지역이 '평화의 녹색지대'가 될 수 있다는 목표를 품었다. 통일 직후엔 경계지역 내 생물 종과 생태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시작했는데 여기엔 연방정부와 각 지방정부도 참여했다.
"1989년 반인륜적인 국경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준비가 잘 돼 있었다. 곧바로 보물창고를 후손을 위해 통일기념물로 보존하자는 비전을 세웠다"고 프로베 교수는 설명했다.
독일 정부는 통일 이후 8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환경친화적인 체험 행사를 만들고, 농경지로 개발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일에도 힘썼다. 독일 전문가들은 한반도 비무장지대도 지금부터 보존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독일 정부와 민간협회의 다음 목표는 유네스코 자연·문화유산 등재이다. 냉전 시절 과거 동구권과의 경계, 즉 북쪽으로 핀란드와 러시아 국경 지역부터 발트해 연안, 중부 유럽, 발칸국가에 이르기까지의 국경 녹색지대를 모두 연계해 인류의 자연·문화유산으로 후손에게 물려주겠다는 원대한 포부이다.
철의 장막이 1,393km 녹색 띠로 변신
한반도의 허리를 동서로 가로지르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분단 시절 동서독 사이에도 비무장지대가 있었다. 장벽과 철책이 설치됐고, 지뢰도 매설됐다. 그런 철의 장막이 통일 이후 어떻게 됐을까? 독일은 철조망을 거둬낸 자리를 개발하는 대신 녹색지대로 변모시켰다. 독일어로 '그뤼네스 반트'(Grünes Band), 철책이 사라진 자리에 녹색 숲이 등장했다. 하늘에서 보면 발트해부터 체코 국경에 이르기까지 1,393km 구간에 녹색 띠가 이어진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하르츠 국립공원. 총면적이 25,000ha로 독일 국립공원 가운데 두 번째로 크다. 옛 동독지역인 작센-안할트주와 옛 서독지역인 니더작센주에 걸쳐 있다. 가장 높은 봉우리인 브로켄 산에서 5월 1일에 마녀들이 연회를 연다는 '발푸르기스의 밤'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기도 하다.
가문비나무가 울창한 하르츠 국립공원 안으로는 분단 시절 동서독 국경이 지났다. 일반인의 접근이 차단됐기에 동식물에 최적의 서식지가 됐다. 통일 이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숲이 보존되면서 다양한 생태 체험 구간이 조성됐다.
다양한 생태체험 탐방로 조성

화창한 날씨가 펼쳐진 9월 22일 오전 9시 무렵, 등산로 입구는 이미 방문객들로 분주했다. 하루 일정으로 브로켄 산까지 가보려 한다는 60대 부부를 만났다. 남편인 요아힘 뷔스테펠트 씨는 "자연과 새, 동물을 관찰하고 이곳에 오면 증기기관차 타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부인 클라우디아도 옆에서 "자연, 해, 초록, 향기가 매우 좋다"고 거들었다.
하르츠 국립공원 안에는 특이한 저수지도 있다. 에커강이 흘러 모인 '에커탈슈페레'란 이름의 저수지인데, 이 저수지 중간으로도 국경이 지났다. 탐방객들은 저수지 위 댐을 지나는 색다른 체험을 하는데, 과거 국경 표시를 보며 상념에 잠기기도 한다. 다니엘 씨는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본연의 모습이 남아있다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평지에서도 녹색 숲은 50~200m의 폭을 이루며 전체 1,393km 구간에 이어져 훌륭한 탐방로가 된다. 바이에른주와 튀링엔주 국경 인근 도시 미트비츠. 취재진은 울창한 숲길을 걸어오는 두 친구를 만났다. 휴가기간 3주 일정으로 그뤼네스 반트를 따라 걷고 있다고 했다. 하루 20km씩 걸은 게 10일이 지난 날이었다.
슈테파니 씨는 "풍경이 계속 바뀐다. 어느 때는 숲을 걷고 어느 때는 넓은 들판이 있고 식물과 동물도 다양하다. 뱀도 보고 독일 동화에 나오는 광대버섯도 많았다"고 그간의 소감을 밝혔다.
분단 시절 동독지역 철책 옆으론 단단한 시멘트 바닥이 만들어졌다. 당시 동독 군인들의 순찰로이자 물자 운송로였다. 30년이 지난 지금 시멘트 바닥 사이로 풀이 자라나 훌륭한 탐방로가 됐다.
이 같은 탐방로는 그뤼네스 반트 17,000여 ha 구석구석에 조성돼 있다. 특히 전체 면적의 84%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동식물 5천여 종이 서식하고 있는데 탐방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그 가운데 1,200여 종은 멸종 위기의 희귀종이어서 보존 가치가 매우 높다.
분단 역사 되새기는 역사교육장

그뤼네스 반트는 훌륭한 생태 체험 구간이면서 동시에 역사교육장 역할도 수행한다. 튀링엔주(옛 동독지역)와 바이에른주(옛 서독지역) 경계에 있는 마을 뫼들라로이트는 매우 특이한 마을이다.
주민 40여 명이 거주하는 이 마을 사이로 작은 실개천이 흐르는데 폭이 50cm 정도밖에 안 된다. 이 실개천 사이로 주 경계선이 지나는데 1945년 독일이 분단되면서 튀링엔주는 동독에, 바이에른주는 서독에 편입됐다. 특별 허가를 받아야 가능했던 마을 간 통행은 1952년부터 중단됐고, 1966년엔 아예 실개천을 따라 동독지역에 장벽과 철조망이 설치됐다. 이 때문에 이 마을은 '작은 베를린'이란 별명을 얻게 됐고, 독일 드라마의 배경 마을이 되기도 했다.
1990년 통일 이후 뫼들라로이트 마을은 분단 시절 시설물을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다. 마을에 들어서면 감시탑과 철조망, 장벽 일부가 남아 있다. 로베르트 레베게른 뫼들라로이트 박물관장은 야외 전시장과 함께 국경 지역의 일상을 볼 수 있는 전시관과 학생과 성인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설명했다. "어떤 방식, 어느 규모로 이 작은 마을을 통해 독일의 분단 역사를 후손을 위해 보존할지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방문객들은 시설물들을 찬찬히 둘러보며 분단의 상처를 더듬어 본다. 코르버 씨는 "분단이 동서독으로 나뉜 마을 양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볼 수 있다. 국경이 얼마나 폭력적인 것인지 보는 게 매우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 해 7만여 명이 마을 자체가 박물관인 이곳을 찾는다. 그뤼네스 반트 전 구간에 48개의 박물관이 있는데, 각 구간의 역사를 특색 있게 보여주고 있다.
민관 30년 협력이 생태계 보전 비결

철조망과 지뢰로 상징되던 지역이 이렇게 생태 숲으로 거듭난 건 저절로 된 게 아니었다.
취재진은 튀링엔주와 바이에른주의 경계도시 중 하나인 미트비츠에서 카이 프로벨 교수를 만났다. 환경생태학자인 프로벨 교수는 10대 후반부터 40여 년간 경계지역 생태계를 연구해 왔다. 프로벨 교수와 같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독일 환경보존협회는 그뤼네스 반트 조성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협회는 통일 이전인 1980년 초반부터 보존을 목표로 국경 지역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1989년 장벽 붕괴와 더불어 국경 지역이 '평화의 녹색지대'가 될 수 있다는 목표를 품었다. 통일 직후엔 경계지역 내 생물 종과 생태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시작했는데 여기엔 연방정부와 각 지방정부도 참여했다.
"1989년 반인륜적인 국경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준비가 잘 돼 있었다. 곧바로 보물창고를 후손을 위해 통일기념물로 보존하자는 비전을 세웠다"고 프로베 교수는 설명했다.
독일 정부는 통일 이후 8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환경친화적인 체험 행사를 만들고, 농경지로 개발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일에도 힘썼다. 독일 전문가들은 한반도 비무장지대도 지금부터 보존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독일 정부와 민간협회의 다음 목표는 유네스코 자연·문화유산 등재이다. 냉전 시절 과거 동구권과의 경계, 즉 북쪽으로 핀란드와 러시아 국경 지역부터 발트해 연안, 중부 유럽, 발칸국가에 이르기까지의 국경 녹색지대를 모두 연계해 인류의 자연·문화유산으로 후손에게 물려주겠다는 원대한 포부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특파원리포트] 독일 통일 30년…냉전의 장벽이 녹색 평화지대로
-
- 입력 2020-10-02 07:09:50

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됐다 다시 통일을 이룩한 독일은 아직 분단 상태인 한국에 늘 연구의 대상이다. 통일의 과정과 통일 전후의 변화가 한국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다. 그런 독일이 10월 3일로 통일 30주년을 맞는다.
철의 장막이 1,393km 녹색 띠로 변신
한반도의 허리를 동서로 가로지르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분단 시절 동서독 사이에도 비무장지대가 있었다. 장벽과 철책이 설치됐고, 지뢰도 매설됐다. 그런 철의 장막이 통일 이후 어떻게 됐을까? 독일은 철조망을 거둬낸 자리를 개발하는 대신 녹색지대로 변모시켰다. 독일어로 '그뤼네스 반트'(Grünes Band), 철책이 사라진 자리에 녹색 숲이 등장했다. 하늘에서 보면 발트해부터 체코 국경에 이르기까지 1,393km 구간에 녹색 띠가 이어진다.

하르츠 국립공원. 총면적이 25,000ha로 독일 국립공원 가운데 두 번째로 크다. 옛 동독지역인 작센-안할트주와 옛 서독지역인 니더작센주에 걸쳐 있다. 가장 높은 봉우리인 브로켄 산에서 5월 1일에 마녀들이 연회를 연다는 '발푸르기스의 밤'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기도 하다.
가문비나무가 울창한 하르츠 국립공원 안으로는 분단 시절 동서독 국경이 지났다. 일반인의 접근이 차단됐기에 동식물에 최적의 서식지가 됐다. 통일 이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숲이 보존되면서 다양한 생태 체험 구간이 조성됐다.
다양한 생태체험 탐방로 조성

화창한 날씨가 펼쳐진 9월 22일 오전 9시 무렵, 등산로 입구는 이미 방문객들로 분주했다. 하루 일정으로 브로켄 산까지 가보려 한다는 60대 부부를 만났다. 남편인 요아힘 뷔스테펠트 씨는 "자연과 새, 동물을 관찰하고 이곳에 오면 증기기관차 타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부인 클라우디아도 옆에서 "자연, 해, 초록, 향기가 매우 좋다"고 거들었다.
하르츠 국립공원 안에는 특이한 저수지도 있다. 에커강이 흘러 모인 '에커탈슈페레'란 이름의 저수지인데, 이 저수지 중간으로도 국경이 지났다. 탐방객들은 저수지 위 댐을 지나는 색다른 체험을 하는데, 과거 국경 표시를 보며 상념에 잠기기도 한다. 다니엘 씨는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본연의 모습이 남아있다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평지에서도 녹색 숲은 50~200m의 폭을 이루며 전체 1,393km 구간에 이어져 훌륭한 탐방로가 된다. 바이에른주와 튀링엔주 국경 인근 도시 미트비츠. 취재진은 울창한 숲길을 걸어오는 두 친구를 만났다. 휴가기간 3주 일정으로 그뤼네스 반트를 따라 걷고 있다고 했다. 하루 20km씩 걸은 게 10일이 지난 날이었다.
슈테파니 씨는 "풍경이 계속 바뀐다. 어느 때는 숲을 걷고 어느 때는 넓은 들판이 있고 식물과 동물도 다양하다. 뱀도 보고 독일 동화에 나오는 광대버섯도 많았다"고 그간의 소감을 밝혔다.
분단 시절 동독지역 철책 옆으론 단단한 시멘트 바닥이 만들어졌다. 당시 동독 군인들의 순찰로이자 물자 운송로였다. 30년이 지난 지금 시멘트 바닥 사이로 풀이 자라나 훌륭한 탐방로가 됐다.
이 같은 탐방로는 그뤼네스 반트 17,000여 ha 구석구석에 조성돼 있다. 특히 전체 면적의 84%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동식물 5천여 종이 서식하고 있는데 탐방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그 가운데 1,200여 종은 멸종 위기의 희귀종이어서 보존 가치가 매우 높다.
분단 역사 되새기는 역사교육장

그뤼네스 반트는 훌륭한 생태 체험 구간이면서 동시에 역사교육장 역할도 수행한다. 튀링엔주(옛 동독지역)와 바이에른주(옛 서독지역) 경계에 있는 마을 뫼들라로이트는 매우 특이한 마을이다.
주민 40여 명이 거주하는 이 마을 사이로 작은 실개천이 흐르는데 폭이 50cm 정도밖에 안 된다. 이 실개천 사이로 주 경계선이 지나는데 1945년 독일이 분단되면서 튀링엔주는 동독에, 바이에른주는 서독에 편입됐다. 특별 허가를 받아야 가능했던 마을 간 통행은 1952년부터 중단됐고, 1966년엔 아예 실개천을 따라 동독지역에 장벽과 철조망이 설치됐다. 이 때문에 이 마을은 '작은 베를린'이란 별명을 얻게 됐고, 독일 드라마의 배경 마을이 되기도 했다.
1990년 통일 이후 뫼들라로이트 마을은 분단 시절 시설물을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다. 마을에 들어서면 감시탑과 철조망, 장벽 일부가 남아 있다. 로베르트 레베게른 뫼들라로이트 박물관장은 야외 전시장과 함께 국경 지역의 일상을 볼 수 있는 전시관과 학생과 성인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설명했다. "어떤 방식, 어느 규모로 이 작은 마을을 통해 독일의 분단 역사를 후손을 위해 보존할지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방문객들은 시설물들을 찬찬히 둘러보며 분단의 상처를 더듬어 본다. 코르버 씨는 "분단이 동서독으로 나뉜 마을 양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볼 수 있다. 국경이 얼마나 폭력적인 것인지 보는 게 매우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 해 7만여 명이 마을 자체가 박물관인 이곳을 찾는다. 그뤼네스 반트 전 구간에 48개의 박물관이 있는데, 각 구간의 역사를 특색 있게 보여주고 있다.
민관 30년 협력이 생태계 보전 비결

철조망과 지뢰로 상징되던 지역이 이렇게 생태 숲으로 거듭난 건 저절로 된 게 아니었다.
취재진은 튀링엔주와 바이에른주의 경계도시 중 하나인 미트비츠에서 카이 프로벨 교수를 만났다. 환경생태학자인 프로벨 교수는 10대 후반부터 40여 년간 경계지역 생태계를 연구해 왔다. 프로벨 교수와 같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독일 환경보존협회는 그뤼네스 반트 조성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협회는 통일 이전인 1980년 초반부터 보존을 목표로 국경 지역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1989년 장벽 붕괴와 더불어 국경 지역이 '평화의 녹색지대'가 될 수 있다는 목표를 품었다. 통일 직후엔 경계지역 내 생물 종과 생태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시작했는데 여기엔 연방정부와 각 지방정부도 참여했다.
"1989년 반인륜적인 국경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준비가 잘 돼 있었다. 곧바로 보물창고를 후손을 위해 통일기념물로 보존하자는 비전을 세웠다"고 프로베 교수는 설명했다.
독일 정부는 통일 이후 8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환경친화적인 체험 행사를 만들고, 농경지로 개발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일에도 힘썼다. 독일 전문가들은 한반도 비무장지대도 지금부터 보존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독일 정부와 민간협회의 다음 목표는 유네스코 자연·문화유산 등재이다. 냉전 시절 과거 동구권과의 경계, 즉 북쪽으로 핀란드와 러시아 국경 지역부터 발트해 연안, 중부 유럽, 발칸국가에 이르기까지의 국경 녹색지대를 모두 연계해 인류의 자연·문화유산으로 후손에게 물려주겠다는 원대한 포부이다.
철의 장막이 1,393km 녹색 띠로 변신
한반도의 허리를 동서로 가로지르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분단 시절 동서독 사이에도 비무장지대가 있었다. 장벽과 철책이 설치됐고, 지뢰도 매설됐다. 그런 철의 장막이 통일 이후 어떻게 됐을까? 독일은 철조망을 거둬낸 자리를 개발하는 대신 녹색지대로 변모시켰다. 독일어로 '그뤼네스 반트'(Grünes Band), 철책이 사라진 자리에 녹색 숲이 등장했다. 하늘에서 보면 발트해부터 체코 국경에 이르기까지 1,393km 구간에 녹색 띠가 이어진다.

하르츠 국립공원. 총면적이 25,000ha로 독일 국립공원 가운데 두 번째로 크다. 옛 동독지역인 작센-안할트주와 옛 서독지역인 니더작센주에 걸쳐 있다. 가장 높은 봉우리인 브로켄 산에서 5월 1일에 마녀들이 연회를 연다는 '발푸르기스의 밤'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기도 하다.
가문비나무가 울창한 하르츠 국립공원 안으로는 분단 시절 동서독 국경이 지났다. 일반인의 접근이 차단됐기에 동식물에 최적의 서식지가 됐다. 통일 이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숲이 보존되면서 다양한 생태 체험 구간이 조성됐다.
다양한 생태체험 탐방로 조성

화창한 날씨가 펼쳐진 9월 22일 오전 9시 무렵, 등산로 입구는 이미 방문객들로 분주했다. 하루 일정으로 브로켄 산까지 가보려 한다는 60대 부부를 만났다. 남편인 요아힘 뷔스테펠트 씨는 "자연과 새, 동물을 관찰하고 이곳에 오면 증기기관차 타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부인 클라우디아도 옆에서 "자연, 해, 초록, 향기가 매우 좋다"고 거들었다.
하르츠 국립공원 안에는 특이한 저수지도 있다. 에커강이 흘러 모인 '에커탈슈페레'란 이름의 저수지인데, 이 저수지 중간으로도 국경이 지났다. 탐방객들은 저수지 위 댐을 지나는 색다른 체험을 하는데, 과거 국경 표시를 보며 상념에 잠기기도 한다. 다니엘 씨는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본연의 모습이 남아있다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평지에서도 녹색 숲은 50~200m의 폭을 이루며 전체 1,393km 구간에 이어져 훌륭한 탐방로가 된다. 바이에른주와 튀링엔주 국경 인근 도시 미트비츠. 취재진은 울창한 숲길을 걸어오는 두 친구를 만났다. 휴가기간 3주 일정으로 그뤼네스 반트를 따라 걷고 있다고 했다. 하루 20km씩 걸은 게 10일이 지난 날이었다.
슈테파니 씨는 "풍경이 계속 바뀐다. 어느 때는 숲을 걷고 어느 때는 넓은 들판이 있고 식물과 동물도 다양하다. 뱀도 보고 독일 동화에 나오는 광대버섯도 많았다"고 그간의 소감을 밝혔다.
분단 시절 동독지역 철책 옆으론 단단한 시멘트 바닥이 만들어졌다. 당시 동독 군인들의 순찰로이자 물자 운송로였다. 30년이 지난 지금 시멘트 바닥 사이로 풀이 자라나 훌륭한 탐방로가 됐다.
이 같은 탐방로는 그뤼네스 반트 17,000여 ha 구석구석에 조성돼 있다. 특히 전체 면적의 84%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동식물 5천여 종이 서식하고 있는데 탐방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그 가운데 1,200여 종은 멸종 위기의 희귀종이어서 보존 가치가 매우 높다.
분단 역사 되새기는 역사교육장

그뤼네스 반트는 훌륭한 생태 체험 구간이면서 동시에 역사교육장 역할도 수행한다. 튀링엔주(옛 동독지역)와 바이에른주(옛 서독지역) 경계에 있는 마을 뫼들라로이트는 매우 특이한 마을이다.
주민 40여 명이 거주하는 이 마을 사이로 작은 실개천이 흐르는데 폭이 50cm 정도밖에 안 된다. 이 실개천 사이로 주 경계선이 지나는데 1945년 독일이 분단되면서 튀링엔주는 동독에, 바이에른주는 서독에 편입됐다. 특별 허가를 받아야 가능했던 마을 간 통행은 1952년부터 중단됐고, 1966년엔 아예 실개천을 따라 동독지역에 장벽과 철조망이 설치됐다. 이 때문에 이 마을은 '작은 베를린'이란 별명을 얻게 됐고, 독일 드라마의 배경 마을이 되기도 했다.
1990년 통일 이후 뫼들라로이트 마을은 분단 시절 시설물을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다. 마을에 들어서면 감시탑과 철조망, 장벽 일부가 남아 있다. 로베르트 레베게른 뫼들라로이트 박물관장은 야외 전시장과 함께 국경 지역의 일상을 볼 수 있는 전시관과 학생과 성인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설명했다. "어떤 방식, 어느 규모로 이 작은 마을을 통해 독일의 분단 역사를 후손을 위해 보존할지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방문객들은 시설물들을 찬찬히 둘러보며 분단의 상처를 더듬어 본다. 코르버 씨는 "분단이 동서독으로 나뉜 마을 양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볼 수 있다. 국경이 얼마나 폭력적인 것인지 보는 게 매우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 해 7만여 명이 마을 자체가 박물관인 이곳을 찾는다. 그뤼네스 반트 전 구간에 48개의 박물관이 있는데, 각 구간의 역사를 특색 있게 보여주고 있다.
민관 30년 협력이 생태계 보전 비결

철조망과 지뢰로 상징되던 지역이 이렇게 생태 숲으로 거듭난 건 저절로 된 게 아니었다.
취재진은 튀링엔주와 바이에른주의 경계도시 중 하나인 미트비츠에서 카이 프로벨 교수를 만났다. 환경생태학자인 프로벨 교수는 10대 후반부터 40여 년간 경계지역 생태계를 연구해 왔다. 프로벨 교수와 같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독일 환경보존협회는 그뤼네스 반트 조성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협회는 통일 이전인 1980년 초반부터 보존을 목표로 국경 지역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1989년 장벽 붕괴와 더불어 국경 지역이 '평화의 녹색지대'가 될 수 있다는 목표를 품었다. 통일 직후엔 경계지역 내 생물 종과 생태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시작했는데 여기엔 연방정부와 각 지방정부도 참여했다.
"1989년 반인륜적인 국경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준비가 잘 돼 있었다. 곧바로 보물창고를 후손을 위해 통일기념물로 보존하자는 비전을 세웠다"고 프로베 교수는 설명했다.
독일 정부는 통일 이후 8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환경친화적인 체험 행사를 만들고, 농경지로 개발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일에도 힘썼다. 독일 전문가들은 한반도 비무장지대도 지금부터 보존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독일 정부와 민간협회의 다음 목표는 유네스코 자연·문화유산 등재이다. 냉전 시절 과거 동구권과의 경계, 즉 북쪽으로 핀란드와 러시아 국경 지역부터 발트해 연안, 중부 유럽, 발칸국가에 이르기까지의 국경 녹색지대를 모두 연계해 인류의 자연·문화유산으로 후손에게 물려주겠다는 원대한 포부이다.
-
-

유광석 기자 ksyoo@kbs.co.kr
유광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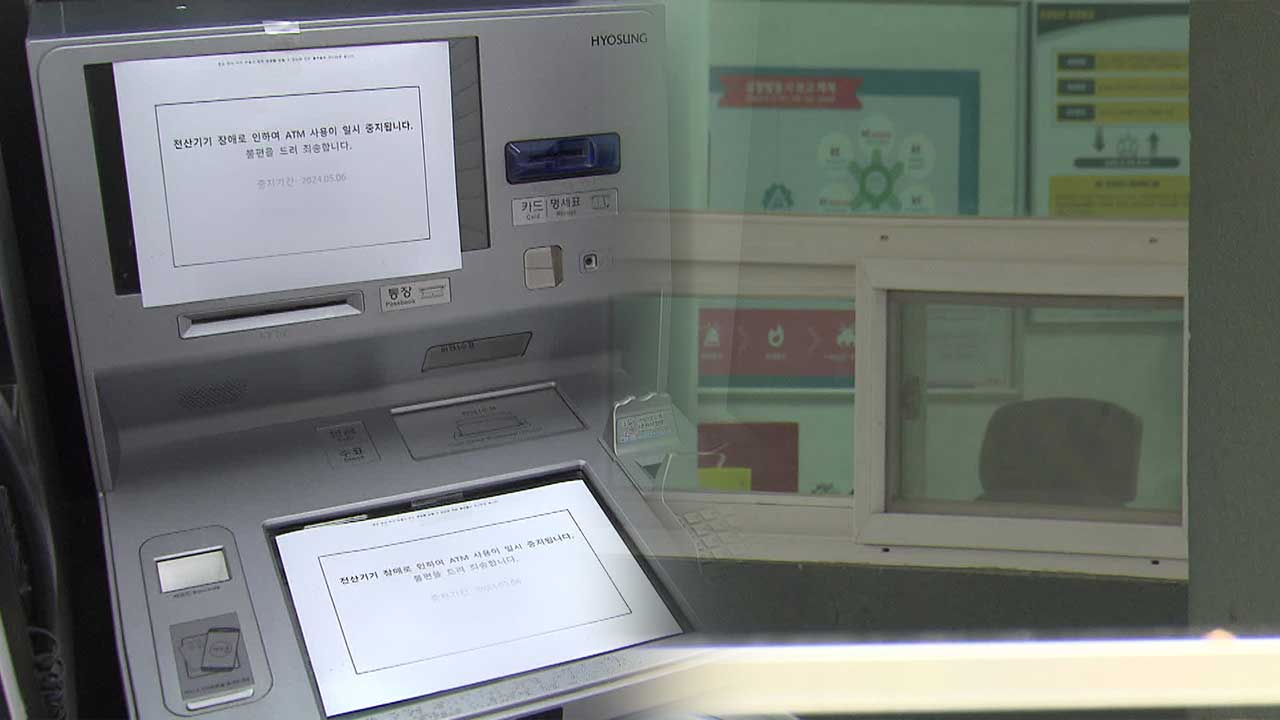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