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국군 용사의 70년만의 귀환기(歸還記)…잠 못드는 호국 영령들
입력 2021.02.09 (06:00)
수정 2021.02.09 (16: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故 조창식 하사의 ‘호국영웅 귀환 패’
故 조창식 하사의 ‘호국영웅 귀환 패’■ 한국전쟁 참전 용사, 70년만에 고향으로….
故 조창식 하사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입니다. 조 하사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3월 16일. 당시 23살의 나이로 국군 제8사단 10연대 소속으로 입대하며 고향인 충북 괴산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5일. 괴산군청에서 열린 '호국영웅 귀환 행사'를 통해 정들었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70년 만의 귀환이었습니다.
 故 조창식 하사의 유해와 유품이 발굴된 강원도 인제군 가전리 야산
故 조창식 하사의 유해와 유품이 발굴된 강원도 인제군 가전리 야산■ 전사 66년 지나 유해 발굴…또다시 시작된 기다림
故 조창식 하사는 1951년 8월 24일, 강원도 인제군 가전리 해발 900m 고지에서 벌어진 '노전평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이후로도 한 달 넘게 계속된 전투로 조 하사의 유해는 수습되지 못했고, 결국 그는 강원도의 이름 없는 산야에 묻혔습니다.
 故 조창식 하사의 전투화와 계급장 등 유품
故 조창식 하사의 전투화와 계급장 등 유품그리고 66년이 흐른 지난 2017년 6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이곳에서 조 하사의 유해 일부와 유품 19점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조 하사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유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 하사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내 보관시설에서 4년 가까이 더 잠들어 있어야 했습니다.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현장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현장■ 한국전쟁 국군 전사자 1만 943구 발굴…신원 확인자 160명뿐
故 조창식 하사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조 하사의 친조카가 지난해 11월 유전자 시료를 채취했기 때문입니다. 조 하사의 유해에서 채취한 유전자와 친조카의 유전자를 비교한 결과, 삼촌과 조카일 확률이 99.97%로 나온 겁니다. 결국, 그는 70년의 기다림 끝에 정든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 2000년부터 한국전쟁 당시 국군 전사자의 유해를 발굴하는 사업을 21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껏 1만 943구의 유해를 발굴했는데, 조창식 하사는 이 가운데 160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입니다. 여전히 1만구가 넘는 호국 영웅의 유해가 보관 시설에서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故 조창식 하사의 귀환 행사에 참석한 군부대 관계자들
故 조창식 하사의 귀환 행사에 참석한 군부대 관계자들■ "나라를 위한 희생, 반드시 보답"…유전자 시료 채취 절실
허욱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은 "나라를 위한 희생은, 언제가 됐든 반드시 보답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신원 확인이 우선돼야 하고, 무엇보다 유가족의 시료 채취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현재까지 유전자 시료 채취에 동참한 한국전쟁 국군 전사자 유가족은 4만 5,000여 명으로, 미수습 전사자 수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어렵게 유해를 수습해도, 정작 대조할 유가족의 유전자가 없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국방부의 ‘한국전쟁 전사자 유가족 DNA 채취’ 홍보물
국방부의 ‘한국전쟁 전사자 유가족 DNA 채취’ 홍보물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는 친가와 외가 8촌까지 가능합니다.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이 한국전쟁에 참전 뒤 아직까지 유해가 미수습됐다면, 가까운 보건소나 보훈병원 등에서 유전자 시료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채취 장소까지 거리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하다면, 유해발굴감식단 대표전화(1577-5625)로 연락하면, 무료로 유전자 시료 채취 장비를 보내줍니다.
 故 조창식 하사의 귀환 행사에 참석한 유가족과 보훈 관계자들
故 조창식 하사의 귀환 행사에 참석한 유가족과 보훈 관계자들한국전쟁 전사자의 직계 가족은 대부분 70대 이상의 고령입니다. 세대가 거듭될수록 자신이 한국전쟁의 유가족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70년의 긴 시간 동안 아직도 여전히 잠들어 있는 13만 호국 영령들이 끝까지 보답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더욱 큰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취재후] 국군 용사의 70년만의 귀환기(歸還記)…잠 못드는 호국 영령들
-
- 입력 2021-02-09 06:00:50
- 수정2021-02-09 16:23:47

■ 한국전쟁 참전 용사, 70년만에 고향으로….
故 조창식 하사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입니다. 조 하사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3월 16일. 당시 23살의 나이로 국군 제8사단 10연대 소속으로 입대하며 고향인 충북 괴산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5일. 괴산군청에서 열린 '호국영웅 귀환 행사'를 통해 정들었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70년 만의 귀환이었습니다.

■ 전사 66년 지나 유해 발굴…또다시 시작된 기다림
故 조창식 하사는 1951년 8월 24일, 강원도 인제군 가전리 해발 900m 고지에서 벌어진 '노전평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이후로도 한 달 넘게 계속된 전투로 조 하사의 유해는 수습되지 못했고, 결국 그는 강원도의 이름 없는 산야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66년이 흐른 지난 2017년 6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이곳에서 조 하사의 유해 일부와 유품 19점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조 하사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유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 하사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내 보관시설에서 4년 가까이 더 잠들어 있어야 했습니다.

■ 한국전쟁 국군 전사자 1만 943구 발굴…신원 확인자 160명뿐
故 조창식 하사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조 하사의 친조카가 지난해 11월 유전자 시료를 채취했기 때문입니다. 조 하사의 유해에서 채취한 유전자와 친조카의 유전자를 비교한 결과, 삼촌과 조카일 확률이 99.97%로 나온 겁니다. 결국, 그는 70년의 기다림 끝에 정든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 2000년부터 한국전쟁 당시 국군 전사자의 유해를 발굴하는 사업을 21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껏 1만 943구의 유해를 발굴했는데, 조창식 하사는 이 가운데 160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입니다. 여전히 1만구가 넘는 호국 영웅의 유해가 보관 시설에서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 "나라를 위한 희생, 반드시 보답"…유전자 시료 채취 절실
허욱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은 "나라를 위한 희생은, 언제가 됐든 반드시 보답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신원 확인이 우선돼야 하고, 무엇보다 유가족의 시료 채취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현재까지 유전자 시료 채취에 동참한 한국전쟁 국군 전사자 유가족은 4만 5,000여 명으로, 미수습 전사자 수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어렵게 유해를 수습해도, 정작 대조할 유가족의 유전자가 없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는 친가와 외가 8촌까지 가능합니다.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이 한국전쟁에 참전 뒤 아직까지 유해가 미수습됐다면, 가까운 보건소나 보훈병원 등에서 유전자 시료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채취 장소까지 거리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하다면, 유해발굴감식단 대표전화(1577-5625)로 연락하면, 무료로 유전자 시료 채취 장비를 보내줍니다.

한국전쟁 전사자의 직계 가족은 대부분 70대 이상의 고령입니다. 세대가 거듭될수록 자신이 한국전쟁의 유가족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70년의 긴 시간 동안 아직도 여전히 잠들어 있는 13만 호국 영령들이 끝까지 보답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더욱 큰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합니다.
-
-

정진규 기자 jin9@kbs.co.kr
정진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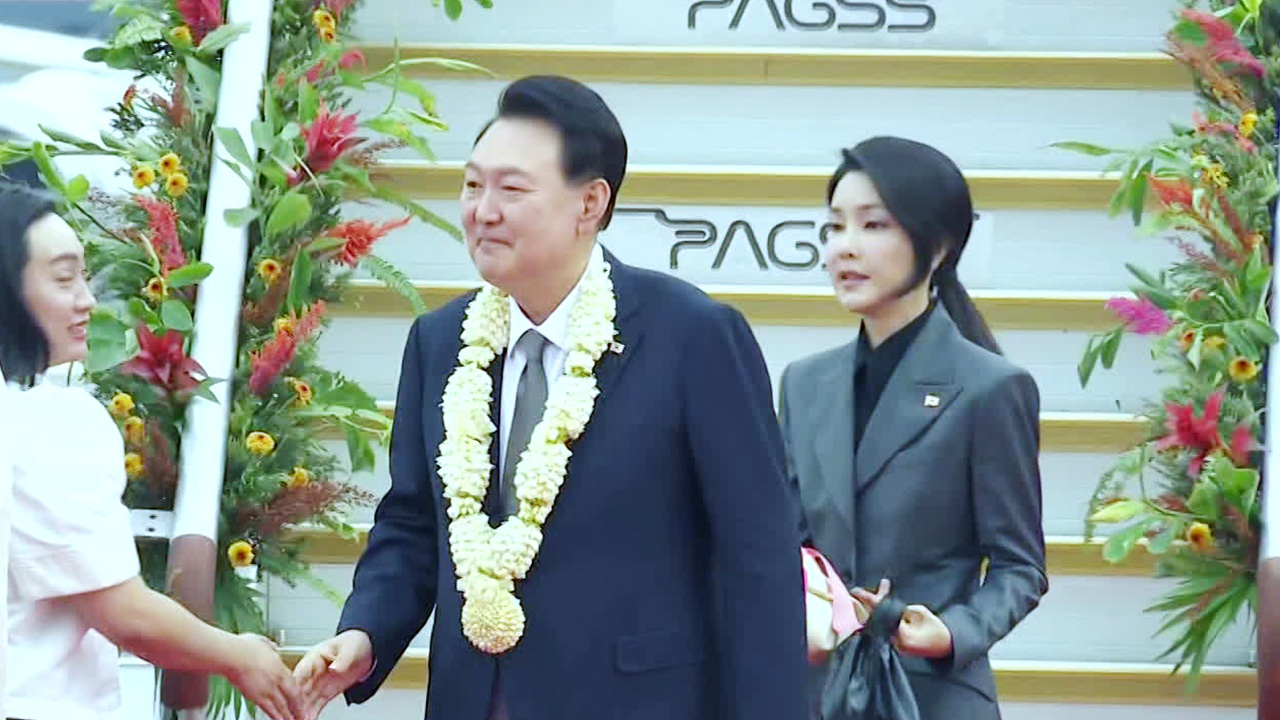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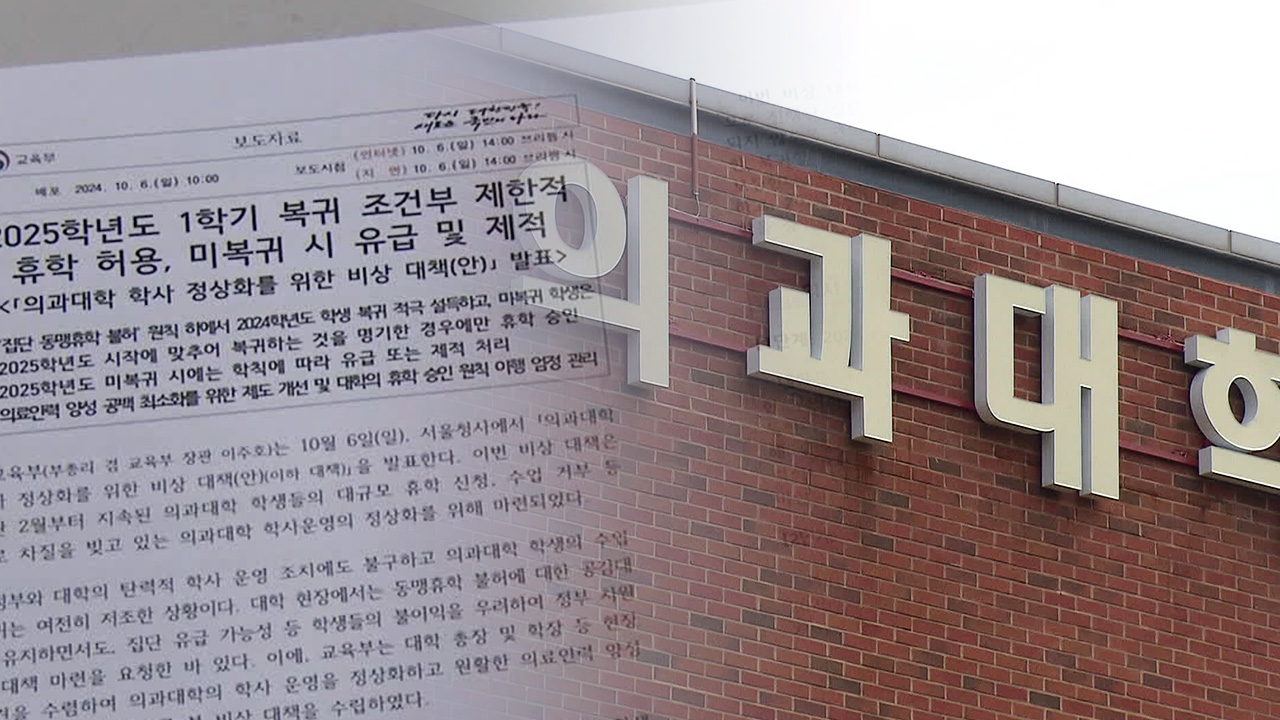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