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몽골발’ 논란에 황사의 ‘진짜 문제’ 묻혔다
입력 2021.03.18 (17:26)
수정 2021.03.18 (20: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중국발이냐, 몽골발이냐'
지난 16일 황사가 국내로 유입된 이후 연일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사가 예상보다 짙지 않아서, 황사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많지 않았는데요. 이번 황사는 엉뚱한 지점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발이냐, 몽골발이냐' 하는 논쟁인데요. 국내 언론이 이번 황사가 '중국발'이라고 보도하자, 중국 환경 당국이 '중국발'이 아니라 '몽골발'이라며 발끈하고 나선 겁니다.
인간이 배출하는 대기 오염 물질이 어디서 왔냐를 두고는 지금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황사'를 두고도 같은 논란이 일어난 겁니다.
■ 세계기상기구 "이번 황사, 몽골과 중국 네이멍구에서 발원"
이번 황사는 세계기상기구(WMO)에서도 소개할 정도로 특이한 '기상 현상'이었습니다.
 이번 황사 기간(지난 14~15일) 황사의 발원과 이동 모습 (자료 : 세계기상기구)
이번 황사 기간(지난 14~15일) 황사의 발원과 이동 모습 (자료 : 세계기상기구)위 영상은 세계기상기구에 내놓은 자료인데요. 색깔로 표현된 것은 황사 모델의 예측 결과이고, 대문자 S로 표시된 것은 실제 관측된 황사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 황사는 지난 14일 몽골에서 발원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북서풍을 타고 황사가 관측되는 지역이 넓어지는데요. 몽골과 인접한 중국 북부와 한반도 북쪽의 만주 지역에서도 황사가 관측됩니다.
그렇다면 세계기상기구는 이번 황사가 어디서 발원했다고 봤을까요? "강력한 몽골 저기압이 몽골의 고비 사막과 중국 네이멍구 중서부 사막 지역의 모래 먼지를 끌어 올렸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황사는 몽골발도 맞고, 중국발도 맞는 겁니다.
■ 삼국시대에도 등장한 '황사'…발원지는 기후학적인 건조 지대
 지형 지도로 살펴본 황사 발원지 (자료 : 구글어스)
지형 지도로 살펴본 황사 발원지 (자료 : 구글어스) 지도에서 국경을 지우고, 이번 황사의 발원지를 살펴봤습니다. 그곳엔 그저 황톳빛의 사막과 메마른 고원만 있을 뿐인데요. 초록빛의 다른 지역들과 차이가 확연합니다.
사막은 지구의 대기 대순환에 따라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입니다. 적도에서 뜨겁게 데워진 뒤 상승한 공기가 고위도로 북상하다 식으면서 가라앉는 지역에 형성됩니다.
공기가 하강하면 고기압이 발달하는데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연중 맑고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 나무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이 된 것입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우토(雨土)’
삼국사기에 기록된 ‘우토(雨土)’그러다 보니 황사는 역사도 깁니다.
우리 역사 기록에 황사가 처음 등장한 것은 무려 2천 년 가까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국사기에 신라 아달라왕(서기 174년) 때 `우토(雨土)', 즉 '흙비'가 내렸다는 기록입니다. 이후 조선왕조실록까지 황사는 우리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OO발' 황사 논쟁은 국경도 없던 시절부터 존재한 황사를 두고, 굳이 지도에 선을 그어 벌이는 싸움인 셈인데요. 그러는 사이 우리는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 왔던 황사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 260년 나이테의 증언…"최근 20년 새 황사 발원지 토양 수분 급감"
정확히 말씀드리면 '황사 발원지'의 변화인데요. 아래 사진을 보시죠. 몽골 고원의 한 호수가 말라가는 모습입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불과 5년 사이 벌어진 일입니다.
 몽골 고원 지대 호수의 2001~2006년 면적 변화 (자료 : 미국 NASA)
몽골 고원 지대 호수의 2001~2006년 면적 변화 (자료 : 미국 NASA)이렇게 말라가는 게 한 지역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남대 연구진을 비롯한 국내외 학자들이 이번 황사 발원지에 해당하는 몽골과 중국 북부의 지난 260년간의 기후 변화를 조사했는데요.
[연관 기사] 260년 나이테의 증언…“폭염·가뭄, 한계선 넘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64434
기상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과거 기후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진은 수령이 260년 이상 된 나무 수십 그루의 나이테를 분석했습니다. 해마다 기상 환경에 따라 두께가 달라지는 나이테의 특성을 이용해 여름철 폭염 일수와 토양 수분의 변화를 복원해낸 겁니다.

그 결과 200년 넘게 완만하게 증가해 온 폭염 일수가 최근 20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붉은색의 그래프가 최근 들어 거의 수직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파란색 그래프는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토양 수분이 지난 20년 동안 크게 감소한 겁니다.
정지훈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기후 변화는 동아시아 지역의 폭염과 가뭄뿐만 아니라 황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그 근거로" 황사가 발생하는 봄철부터 가뭄이 강해지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자연적으로 존재하던 황사 발원지가 인간이 만든 기후 변화로 더 메마르고,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나무 심기도 소용없어…"기후 변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정 교수는 "기상학적으로 가뭄이 몇 해 이어진 정도가 아니라, 지구 온난화로 본질적인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변화의 심각성을 설명했는데요.
상황을 되돌리기 위한 노력도 헛수고였다고 했습니다. 정 교수는 중국 학자의 말을 인용해 "매년 수십만 명이 황사 발원지에 가서 나무를 심어왔는데, 그다음 해에 가면 다 죽어버렸다고 전해 들었다"면서 "사람의 힘으로 기후 변화를 돌이키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10년 만에 최악이라는 이번 황사도 이런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한반도로 오는 동안 옅어지며 국내에는 큰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지금처럼 황사 발원지의 상황이 악화한다면 우리나라에도 강한 황사가 덮칠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그 원인은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기후 위기라는 인류 공동의 문제에 있다는 게 과학자들의 분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국발·몽골발’ 논란에 황사의 ‘진짜 문제’ 묻혔다
-
- 입력 2021-03-18 17:26:51
- 수정2021-03-18 20:31:19

■ '중국발이냐, 몽골발이냐'
지난 16일 황사가 국내로 유입된 이후 연일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사가 예상보다 짙지 않아서, 황사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많지 않았는데요. 이번 황사는 엉뚱한 지점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발이냐, 몽골발이냐' 하는 논쟁인데요. 국내 언론이 이번 황사가 '중국발'이라고 보도하자, 중국 환경 당국이 '중국발'이 아니라 '몽골발'이라며 발끈하고 나선 겁니다.
인간이 배출하는 대기 오염 물질이 어디서 왔냐를 두고는 지금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황사'를 두고도 같은 논란이 일어난 겁니다.
■ 세계기상기구 "이번 황사, 몽골과 중국 네이멍구에서 발원"
이번 황사는 세계기상기구(WMO)에서도 소개할 정도로 특이한 '기상 현상'이었습니다.

위 영상은 세계기상기구에 내놓은 자료인데요. 색깔로 표현된 것은 황사 모델의 예측 결과이고, 대문자 S로 표시된 것은 실제 관측된 황사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 황사는 지난 14일 몽골에서 발원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북서풍을 타고 황사가 관측되는 지역이 넓어지는데요. 몽골과 인접한 중국 북부와 한반도 북쪽의 만주 지역에서도 황사가 관측됩니다.
그렇다면 세계기상기구는 이번 황사가 어디서 발원했다고 봤을까요? "강력한 몽골 저기압이 몽골의 고비 사막과 중국 네이멍구 중서부 사막 지역의 모래 먼지를 끌어 올렸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황사는 몽골발도 맞고, 중국발도 맞는 겁니다.
■ 삼국시대에도 등장한 '황사'…발원지는 기후학적인 건조 지대

지도에서 국경을 지우고, 이번 황사의 발원지를 살펴봤습니다. 그곳엔 그저 황톳빛의 사막과 메마른 고원만 있을 뿐인데요. 초록빛의 다른 지역들과 차이가 확연합니다.
사막은 지구의 대기 대순환에 따라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입니다. 적도에서 뜨겁게 데워진 뒤 상승한 공기가 고위도로 북상하다 식으면서 가라앉는 지역에 형성됩니다.
공기가 하강하면 고기압이 발달하는데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연중 맑고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 나무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황사는 역사도 깁니다.
우리 역사 기록에 황사가 처음 등장한 것은 무려 2천 년 가까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국사기에 신라 아달라왕(서기 174년) 때 `우토(雨土)', 즉 '흙비'가 내렸다는 기록입니다. 이후 조선왕조실록까지 황사는 우리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OO발' 황사 논쟁은 국경도 없던 시절부터 존재한 황사를 두고, 굳이 지도에 선을 그어 벌이는 싸움인 셈인데요. 그러는 사이 우리는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 왔던 황사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 260년 나이테의 증언…"최근 20년 새 황사 발원지 토양 수분 급감"
정확히 말씀드리면 '황사 발원지'의 변화인데요. 아래 사진을 보시죠. 몽골 고원의 한 호수가 말라가는 모습입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불과 5년 사이 벌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말라가는 게 한 지역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남대 연구진을 비롯한 국내외 학자들이 이번 황사 발원지에 해당하는 몽골과 중국 북부의 지난 260년간의 기후 변화를 조사했는데요.
[연관 기사] 260년 나이테의 증언…“폭염·가뭄, 한계선 넘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64434
기상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과거 기후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진은 수령이 260년 이상 된 나무 수십 그루의 나이테를 분석했습니다. 해마다 기상 환경에 따라 두께가 달라지는 나이테의 특성을 이용해 여름철 폭염 일수와 토양 수분의 변화를 복원해낸 겁니다.

그 결과 200년 넘게 완만하게 증가해 온 폭염 일수가 최근 20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붉은색의 그래프가 최근 들어 거의 수직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파란색 그래프는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토양 수분이 지난 20년 동안 크게 감소한 겁니다.
정지훈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기후 변화는 동아시아 지역의 폭염과 가뭄뿐만 아니라 황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그 근거로" 황사가 발생하는 봄철부터 가뭄이 강해지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자연적으로 존재하던 황사 발원지가 인간이 만든 기후 변화로 더 메마르고,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나무 심기도 소용없어…"기후 변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정 교수는 "기상학적으로 가뭄이 몇 해 이어진 정도가 아니라, 지구 온난화로 본질적인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변화의 심각성을 설명했는데요.
상황을 되돌리기 위한 노력도 헛수고였다고 했습니다. 정 교수는 중국 학자의 말을 인용해 "매년 수십만 명이 황사 발원지에 가서 나무를 심어왔는데, 그다음 해에 가면 다 죽어버렸다고 전해 들었다"면서 "사람의 힘으로 기후 변화를 돌이키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10년 만에 최악이라는 이번 황사도 이런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한반도로 오는 동안 옅어지며 국내에는 큰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지금처럼 황사 발원지의 상황이 악화한다면 우리나라에도 강한 황사가 덮칠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그 원인은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기후 위기라는 인류 공동의 문제에 있다는 게 과학자들의 분석입니다.
-
-

이정훈 기자 skyclear@kbs.co.kr
이정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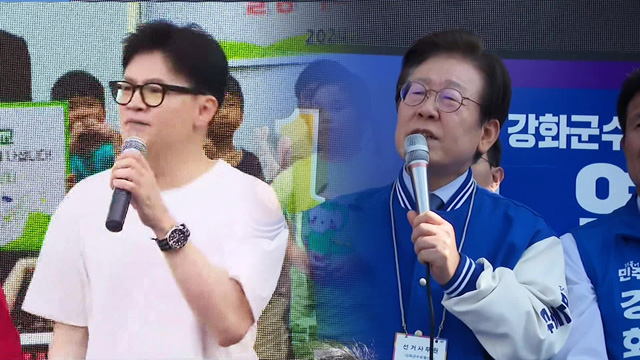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