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난화로 인한 기상 재앙 시작됐다
입력 2004.03.23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지 꼭 100년이 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나라 기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온난화의 영향으로 기후변화는 더 빨라져서 앞으로 100년 후에는 아열대 기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기문 기자의 심층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양재동 도로변에 작은 대나무숲입니다.
대나무 재배의 북방한계선보다 200km 이상 북쪽에서 겨울을 났지만 녹색빛이 선명합니다.
홍릉수목원에도 난대성 수목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전남 완도에서 옮겨진 황칠나무와 감탕나무, 가시나무 등입니다.
난대성 식물은 남해안 북쪽지역에서 자랄 수 없다는 지금까지의 통념이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명섭(박사/국립산림과학원): 5년 동안 견뎌내는 것으로 보았을 때 서울시내에서도 원만하게, 무난하게 앞으로도 자라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기자: 가을에 남쪽으로 날아가던 백로는 기온이 높아지면서 겨울에도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름철새 황로는 80년대 초에는 주로 남해안 지역에서 관찰됐지만 시간이 갈수록 북상해 지금은 강원도 철원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태계의 변화는 그 동안 한반도의 기후가 점차 따뜻해지면서 겨울기간이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조사 결과 그 동안 한반도의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하면서 겨울기간은 1920년대에 비해 27일이나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원태(박사/기상연구소): 전 세계 평균기온이 0.6도 상승하였고 우리나라는 1.5도 상승하여 세계 수준의 2배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 이런 기온 상승은 동아시아 지역의 대기 흐름을 뒤바꿔 대형 기상재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에 볼 수 없었던 초강력 태풍 루사와 매미의 내습, 장마가 끝난 뒤 시작되는 8월 폭우는 점차 연래화되고 점차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150mm 이상의 집중호우는 1970년대 연평균 38회에서 90년대에는 71회로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태영(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 우리나라 주변 국지적인 조건보다는 전 지구적인 흐름과 변화와 상당히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기상청은 100년 후 우리나라의 기온이 지금보다 6도 가량이나 더 높아져 서울이 지금의 중국 상하이 정도의 아열대 지역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정규(기상청 기후예측과장): 극단적인 기상 현상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면서 대형 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자: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앞으로의 기상 재해는 재앙 수준으로 강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기상재해를 극복하는 문제가 생산양을 확대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해질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KBS뉴스 이기문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나라 기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온난화의 영향으로 기후변화는 더 빨라져서 앞으로 100년 후에는 아열대 기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기문 기자의 심층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양재동 도로변에 작은 대나무숲입니다.
대나무 재배의 북방한계선보다 200km 이상 북쪽에서 겨울을 났지만 녹색빛이 선명합니다.
홍릉수목원에도 난대성 수목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전남 완도에서 옮겨진 황칠나무와 감탕나무, 가시나무 등입니다.
난대성 식물은 남해안 북쪽지역에서 자랄 수 없다는 지금까지의 통념이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명섭(박사/국립산림과학원): 5년 동안 견뎌내는 것으로 보았을 때 서울시내에서도 원만하게, 무난하게 앞으로도 자라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기자: 가을에 남쪽으로 날아가던 백로는 기온이 높아지면서 겨울에도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름철새 황로는 80년대 초에는 주로 남해안 지역에서 관찰됐지만 시간이 갈수록 북상해 지금은 강원도 철원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태계의 변화는 그 동안 한반도의 기후가 점차 따뜻해지면서 겨울기간이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조사 결과 그 동안 한반도의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하면서 겨울기간은 1920년대에 비해 27일이나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원태(박사/기상연구소): 전 세계 평균기온이 0.6도 상승하였고 우리나라는 1.5도 상승하여 세계 수준의 2배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 이런 기온 상승은 동아시아 지역의 대기 흐름을 뒤바꿔 대형 기상재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에 볼 수 없었던 초강력 태풍 루사와 매미의 내습, 장마가 끝난 뒤 시작되는 8월 폭우는 점차 연래화되고 점차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150mm 이상의 집중호우는 1970년대 연평균 38회에서 90년대에는 71회로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태영(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 우리나라 주변 국지적인 조건보다는 전 지구적인 흐름과 변화와 상당히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기상청은 100년 후 우리나라의 기온이 지금보다 6도 가량이나 더 높아져 서울이 지금의 중국 상하이 정도의 아열대 지역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정규(기상청 기후예측과장): 극단적인 기상 현상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면서 대형 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자: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앞으로의 기상 재해는 재앙 수준으로 강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기상재해를 극복하는 문제가 생산양을 확대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해질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KBS뉴스 이기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온난화로 인한 기상 재앙 시작됐다
-
- 입력 2004-03-23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지 꼭 100년이 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나라 기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온난화의 영향으로 기후변화는 더 빨라져서 앞으로 100년 후에는 아열대 기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기문 기자의 심층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양재동 도로변에 작은 대나무숲입니다.
대나무 재배의 북방한계선보다 200km 이상 북쪽에서 겨울을 났지만 녹색빛이 선명합니다.
홍릉수목원에도 난대성 수목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전남 완도에서 옮겨진 황칠나무와 감탕나무, 가시나무 등입니다.
난대성 식물은 남해안 북쪽지역에서 자랄 수 없다는 지금까지의 통념이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명섭(박사/국립산림과학원): 5년 동안 견뎌내는 것으로 보았을 때 서울시내에서도 원만하게, 무난하게 앞으로도 자라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기자: 가을에 남쪽으로 날아가던 백로는 기온이 높아지면서 겨울에도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름철새 황로는 80년대 초에는 주로 남해안 지역에서 관찰됐지만 시간이 갈수록 북상해 지금은 강원도 철원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태계의 변화는 그 동안 한반도의 기후가 점차 따뜻해지면서 겨울기간이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조사 결과 그 동안 한반도의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하면서 겨울기간은 1920년대에 비해 27일이나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원태(박사/기상연구소): 전 세계 평균기온이 0.6도 상승하였고 우리나라는 1.5도 상승하여 세계 수준의 2배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 이런 기온 상승은 동아시아 지역의 대기 흐름을 뒤바꿔 대형 기상재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에 볼 수 없었던 초강력 태풍 루사와 매미의 내습, 장마가 끝난 뒤 시작되는 8월 폭우는 점차 연래화되고 점차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150mm 이상의 집중호우는 1970년대 연평균 38회에서 90년대에는 71회로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태영(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 우리나라 주변 국지적인 조건보다는 전 지구적인 흐름과 변화와 상당히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기상청은 100년 후 우리나라의 기온이 지금보다 6도 가량이나 더 높아져 서울이 지금의 중국 상하이 정도의 아열대 지역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정규(기상청 기후예측과장): 극단적인 기상 현상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면서 대형 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자: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앞으로의 기상 재해는 재앙 수준으로 강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기상재해를 극복하는 문제가 생산양을 확대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해질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KBS뉴스 이기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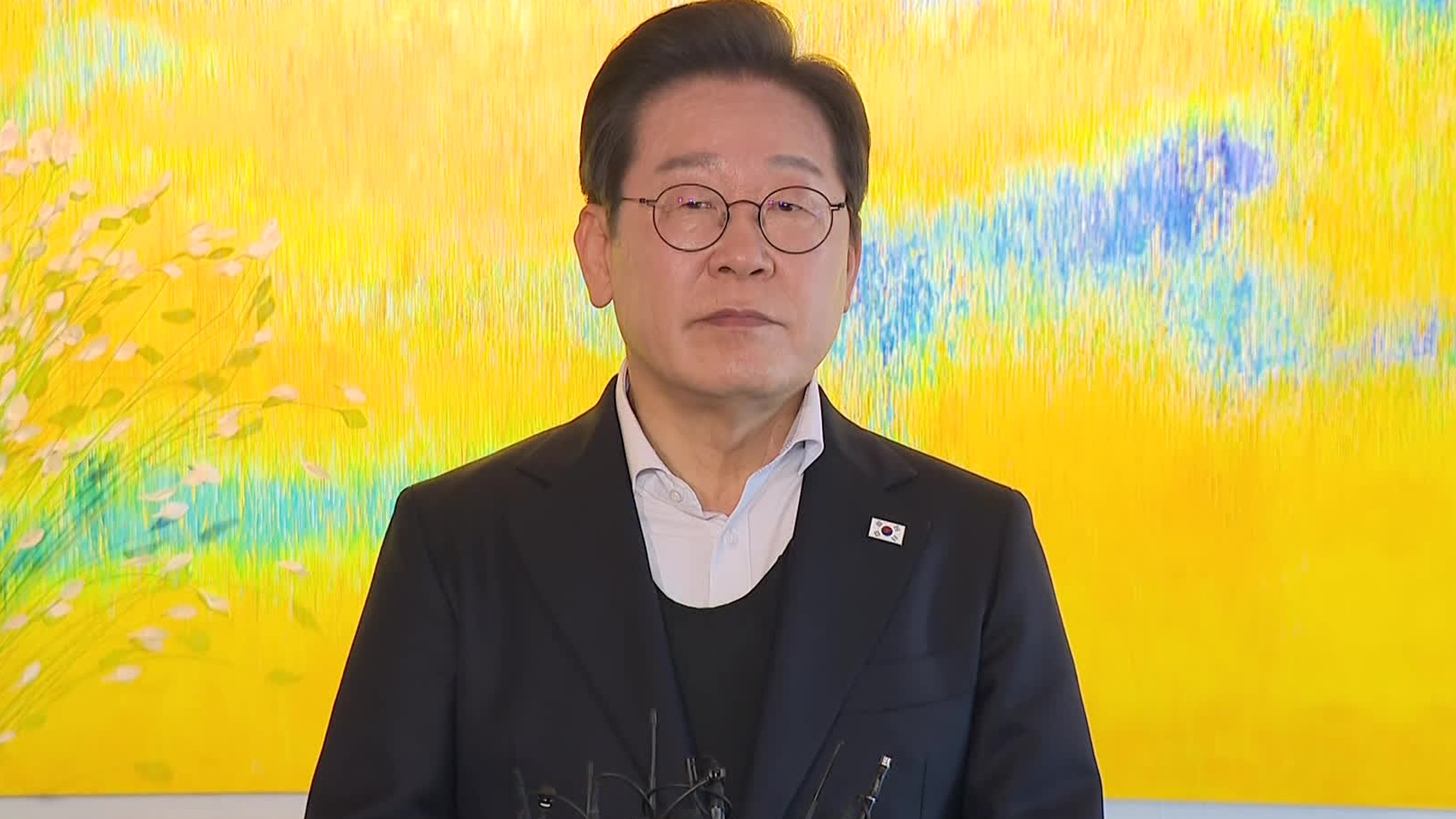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