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존경 받는 지도층은?
입력 2011.01.26 (07:30)
수정 2011.01.26 (09:21)
안내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내용
요약 내용은 네이버 CLOVA Summary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김용관 해설위원]
며칠 전까지 우리는 또 한 번의 인사청문회를 치렀지요? 정부부처 수장이 바뀔 때마다 겪는 또 한 차례 홍역이지요. 군대를 갈 수 있었는데 안 갔다느니, 법을 어겨가며 투기로 재산을 모았다느니, 세금을 내지 않았다느니, 남의 논문을 베꼈다느니... 공방은 계속되고 결론은 제각각... 청문회는 거듭돼도 풍경은 똑같습니다.
이런 진풍경을 보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비감함 그것입니다. 공직 후보자의 삶에서 드러나는 탐욕과 도덕적 불감증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권력의 볕만 쫒고 마른 땅만 골라 디디며 사회적 의무를 도외시하며 살아온 일부 지도층에 대해 분노하기도 하죠.
이럴 때... 신선한 소식 하나가 들려오네요. 유감스럽지만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요. 싱가포르 독립의 아버지 리콴유 전 총리 얘깁니다. 자신이 죽으면 살던 집을 국가 성지로 지정하지 말고 허물라고 했답니다. 보존에 돈이 많이 들고 주변 건축제한 등으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랍니다. 권좌에서 내려오면 서둘러 기념관부터 짓는 우리나라 지도자들과는 사뭇 다르지요?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리콴유 전 총리가 백 년 전 지어진 낡은 이 집에서 무려 70년이나 살았다는 점입니다.
리콴유가 회사 총수처럼 나라를 다스렸던 독재자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서정연한 시민의식, 세계 제일의 청렴도, 세계 선두권의 국가경쟁력을 자랑하는 일류국가 싱가포르를 건설한 주역이라는 평판이 압도적입니다. 자신의 영달보다는 이웃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삶의 당연한 귀결이겠지요.
평생을 서민과 더불어 소박한 삶을 살았던 베트남의 호찌민이나 인도의 간디 같은 지도자를 우리가 갖는다면 참 행운이겠지요? 욕심이기도 하겠고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보다 나은 세상과 불행한 이웃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지도층들이 있지요. 아프리카 수단에서 성스러운 삶을 살다 1년 전 세상을 떠난 이태석 신부 같은 이들 말입니다. 이런 삶이 주는 감동이 양극화 시대 서민들의 강퍅하고 불안한 삶의 버팀목이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권한을 갖는 사람들이 사회에 대해 지는 책임은 그래서 그만큼 무겁습니다. 지도층이 이 책임을 의무로 받아들이고 실천할 때 우리나라가 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요?
며칠 전까지 우리는 또 한 번의 인사청문회를 치렀지요? 정부부처 수장이 바뀔 때마다 겪는 또 한 차례 홍역이지요. 군대를 갈 수 있었는데 안 갔다느니, 법을 어겨가며 투기로 재산을 모았다느니, 세금을 내지 않았다느니, 남의 논문을 베꼈다느니... 공방은 계속되고 결론은 제각각... 청문회는 거듭돼도 풍경은 똑같습니다.
이런 진풍경을 보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비감함 그것입니다. 공직 후보자의 삶에서 드러나는 탐욕과 도덕적 불감증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권력의 볕만 쫒고 마른 땅만 골라 디디며 사회적 의무를 도외시하며 살아온 일부 지도층에 대해 분노하기도 하죠.
이럴 때... 신선한 소식 하나가 들려오네요. 유감스럽지만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요. 싱가포르 독립의 아버지 리콴유 전 총리 얘깁니다. 자신이 죽으면 살던 집을 국가 성지로 지정하지 말고 허물라고 했답니다. 보존에 돈이 많이 들고 주변 건축제한 등으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랍니다. 권좌에서 내려오면 서둘러 기념관부터 짓는 우리나라 지도자들과는 사뭇 다르지요?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리콴유 전 총리가 백 년 전 지어진 낡은 이 집에서 무려 70년이나 살았다는 점입니다.
리콴유가 회사 총수처럼 나라를 다스렸던 독재자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서정연한 시민의식, 세계 제일의 청렴도, 세계 선두권의 국가경쟁력을 자랑하는 일류국가 싱가포르를 건설한 주역이라는 평판이 압도적입니다. 자신의 영달보다는 이웃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삶의 당연한 귀결이겠지요.
평생을 서민과 더불어 소박한 삶을 살았던 베트남의 호찌민이나 인도의 간디 같은 지도자를 우리가 갖는다면 참 행운이겠지요? 욕심이기도 하겠고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보다 나은 세상과 불행한 이웃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지도층들이 있지요. 아프리카 수단에서 성스러운 삶을 살다 1년 전 세상을 떠난 이태석 신부 같은 이들 말입니다. 이런 삶이 주는 감동이 양극화 시대 서민들의 강퍅하고 불안한 삶의 버팀목이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권한을 갖는 사람들이 사회에 대해 지는 책임은 그래서 그만큼 무겁습니다. 지도층이 이 책임을 의무로 받아들이고 실천할 때 우리나라가 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요?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많이 본 뉴스
각 플랫폼 별 많이 본 기사 (최근 1시간)
![[건강하게 삽시다] 30∼40대 뇌졸중](https://news.kbs.co.kr/data/news/2011/01/26/2232750_14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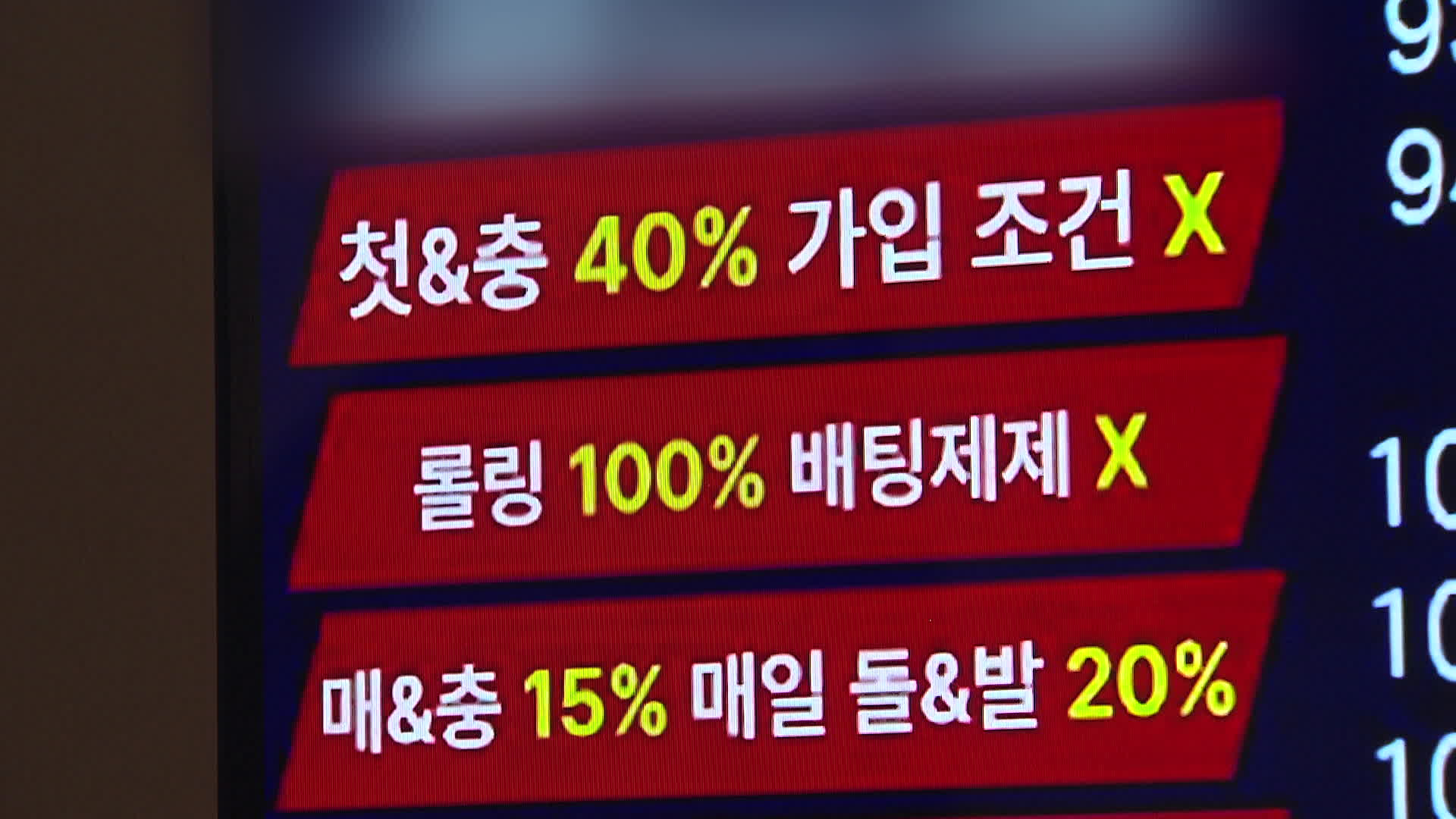



![[영상] 17살 맞아?…한·중 사격 천재 파리에서 한판 승부](/data/fckeditor/vod/2024/07/29/kn105391722250584626.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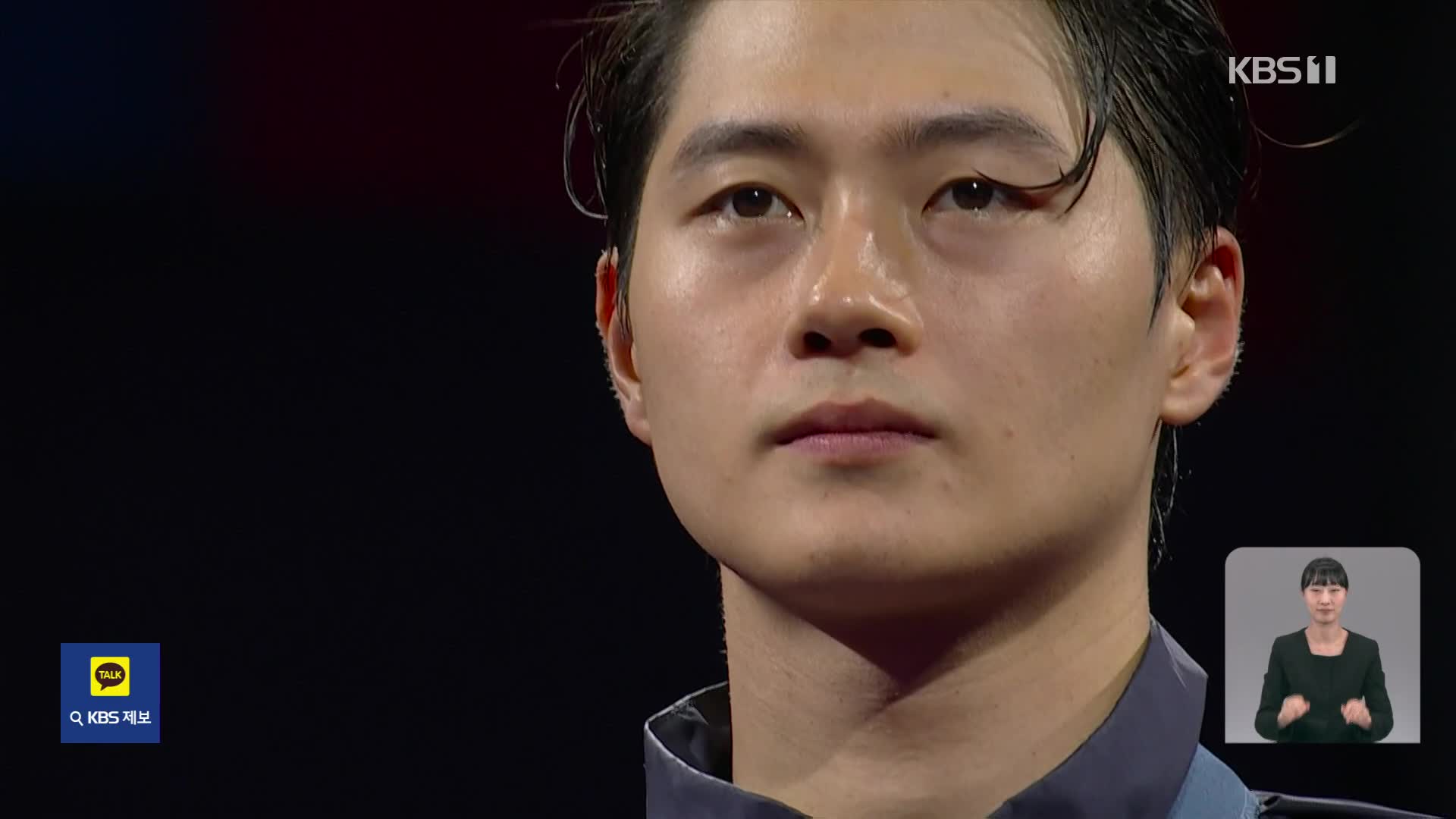





![[7회] 귀가 아파요 … ‘hurt’의 올바른 사용법](/data/news/2011/01/14/2226849_umF.jpg)
![[뉴스따라잡기] ‘체내림’ 시술받다 식도 손상](/data/news/2011/02/07/2238138_1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