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악질 성범죄에 전자발찌도 ‘무용지물’
입력 2012.08.21 (22:03)
수정 2012.08.22 (10:19)
안내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내용
요약 내용은 네이버 CLOVA Summary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앵커 멘트>
이런 성범죄 등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한 지 4년이 됐습니다.
현재 성폭력과 살인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있는 사람은 모두 1,030명입니다.
지난 2008년의 백50명보다 7배나 늘어난 건데요.
이 가운데 60% 정도를 성범죄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의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좀 더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김시원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순식간에 날벼락을 맞은 이 씨의 가족들은 말을 잊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현실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인터뷰> 피해자 어머니 : "전자발찌를 몇 번씩 찬 놈을 감시 안하고 그냥 놔뒀다는 것이...국가가 책임을 지고 해 줘야 돼. 살려 줘야지."
서 씨가 전자발찌를 찬 건 지난해 11월.
서울보호관찰소는 범행 이틀 전까지 서 씨를 52차례나 면담하고, 보호관찰일지도 440건이나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전자발찌를 찼다고 해도 위치추적만 될 뿐 어떤 행동을 하는 지는 감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강호성(법무부 보호관찰과장) : "성범죄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가 아닙니다. 심적 억제를 가해서 본인 스스로가 범죄를 하면 반드시 검거된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전자발찌 착용자는 천명이 넘는데 전담 인력은 고작 76명,
성폭력 전과자의 재범률을 크게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었지만, 악질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한계도 분명한 겁니다.
법무부만 볼 수 있는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위치정보를 경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성범죄자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전과도 여러번이고 성범죄 전과도 있는 고위험군 같은 경우 경찰이 정기적으로 대면접촉을 해서 우범자 관리를 하는..."
약물치료를 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
습관적인 성범죄를 일종의 질병으로 보고 약물과 상담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권재진(법무부장관) : "약물치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심리치료. 이런 전문적인 치료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악질 성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근절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이런 성범죄 등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한 지 4년이 됐습니다.
현재 성폭력과 살인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있는 사람은 모두 1,030명입니다.
지난 2008년의 백50명보다 7배나 늘어난 건데요.
이 가운데 60% 정도를 성범죄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의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좀 더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김시원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순식간에 날벼락을 맞은 이 씨의 가족들은 말을 잊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현실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인터뷰> 피해자 어머니 : "전자발찌를 몇 번씩 찬 놈을 감시 안하고 그냥 놔뒀다는 것이...국가가 책임을 지고 해 줘야 돼. 살려 줘야지."
서 씨가 전자발찌를 찬 건 지난해 11월.
서울보호관찰소는 범행 이틀 전까지 서 씨를 52차례나 면담하고, 보호관찰일지도 440건이나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전자발찌를 찼다고 해도 위치추적만 될 뿐 어떤 행동을 하는 지는 감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강호성(법무부 보호관찰과장) : "성범죄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가 아닙니다. 심적 억제를 가해서 본인 스스로가 범죄를 하면 반드시 검거된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전자발찌 착용자는 천명이 넘는데 전담 인력은 고작 76명,
성폭력 전과자의 재범률을 크게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었지만, 악질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한계도 분명한 겁니다.
법무부만 볼 수 있는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위치정보를 경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성범죄자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전과도 여러번이고 성범죄 전과도 있는 고위험군 같은 경우 경찰이 정기적으로 대면접촉을 해서 우범자 관리를 하는..."
약물치료를 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
습관적인 성범죄를 일종의 질병으로 보고 약물과 상담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권재진(법무부장관) : "약물치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심리치료. 이런 전문적인 치료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악질 성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근절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많이 본 뉴스
각 플랫폼 별 많이 본 기사 (최근 1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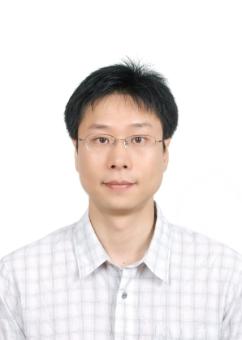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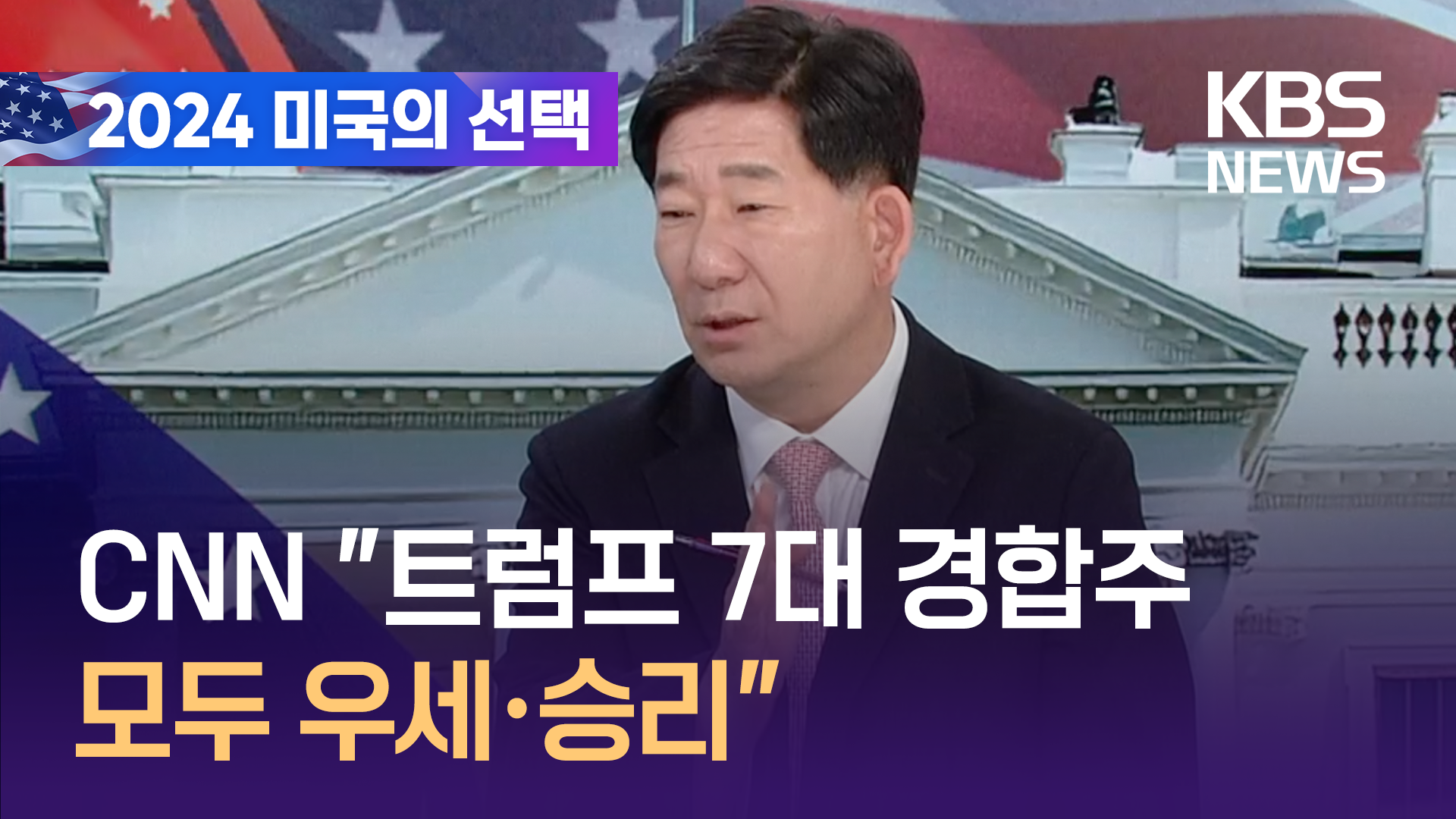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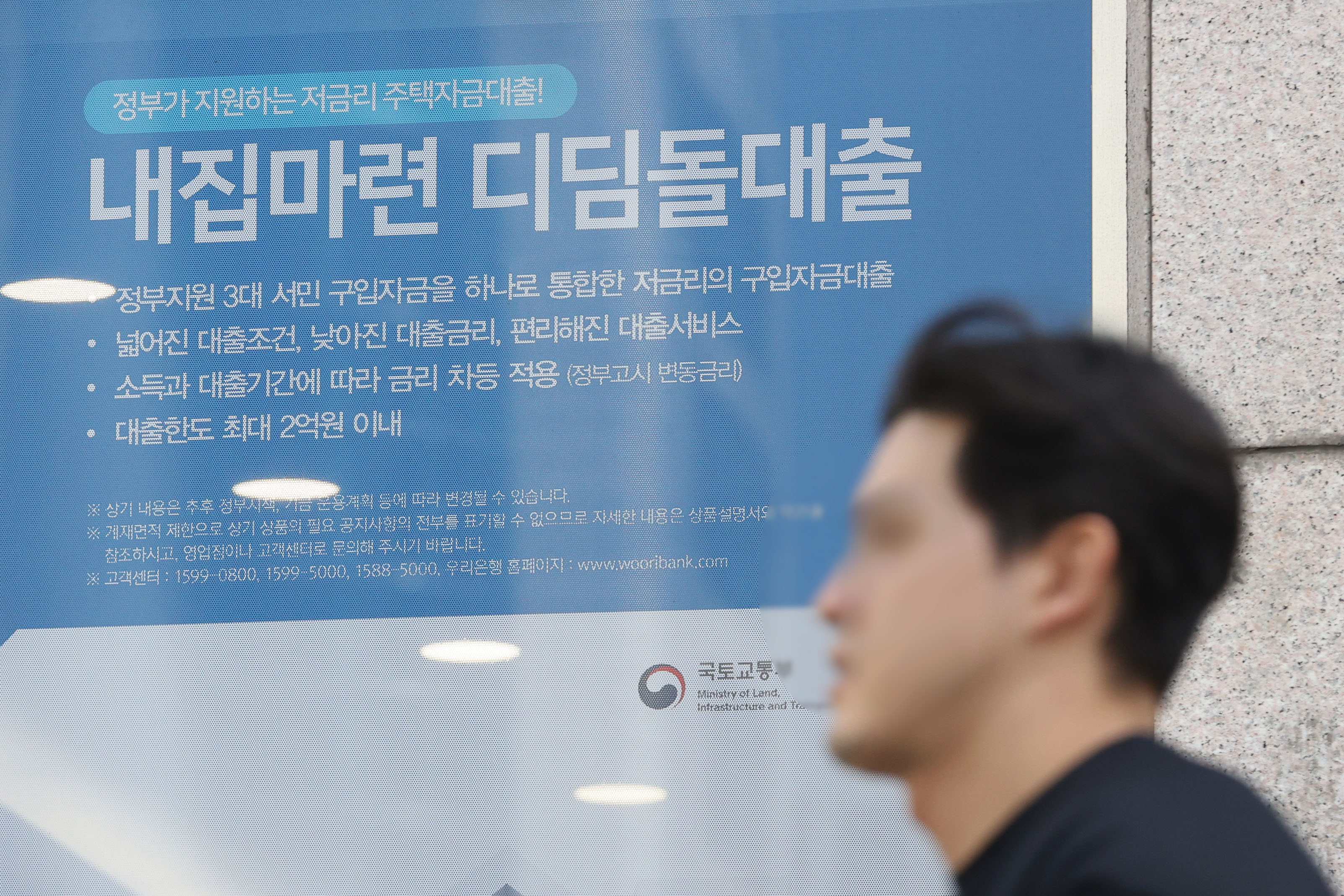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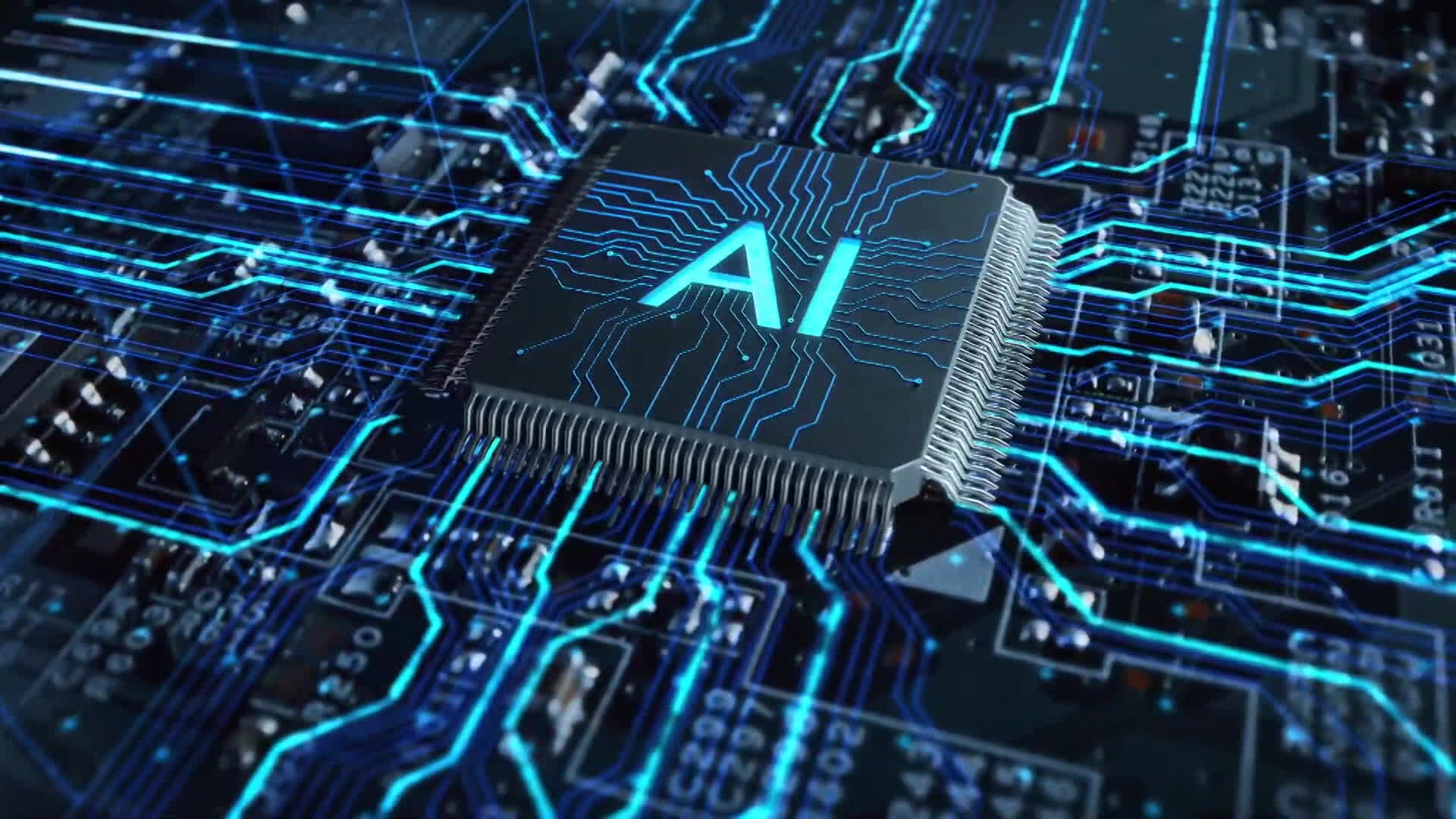

![[화제포착] 감독 아빠·코치 엄마…딸은 선수](/data/news/2012/08/30/2527431_1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