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 뿐인 ‘용감한 시민’…겉도는 의사상자 지원
입력 2013.03.30 (07:24)
수정 2013.03.30 (16:16)
안내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내용
요약 내용은 네이버 CLOVA Summary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앵커 멘트>
지하철 선로로 내려가 취객을 구하는 등 의로운 일을 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용감한 시민들을 '의사상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의사상자 지원책이 미비해 사회의 귀감인 용감한 시민들이 고통속에 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윤정용씨는 이 길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10여 년 전 이곳에서 차에 치일뻔한 초등학생 2명을 구하고, 대신 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한 아이는 밀치고, 한 아이는 내가 안고..."
의사상자로 인정받아 당시 정부에서 보상금 250만 원을 받았지만 대부분 병원비로 썼습니다.
무엇보다 가장인 윤씨가 다리를 다쳐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인터뷰> 윤정용(의사상자) : "살길이 막연하니까, 나는 나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흩어진 거죠. 노동력을 상실하니까 가정도 파탄된 거죠."
윤씨처럼 의로운 일을 하다 다치거나 숨진 사람들에게 정부는 급수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의료와 취업, 자녀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절실한 취업 지원은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이렇다보니 대부분은 실업자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인터뷰> 김명득(의사상자) : "박스도 줍고, 고철도 줍고 해서... 하루에 많이 벌면 돈 만원도 벌고 못 벌 땐 몇 천원도 못 벌고..."
지난 1970년 의사상자 지원법이 마련된 이후 남을 구하려다 다친 사람은 222명, 사망한 사람도 4백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겉도는 지원책에 용감한 시민들의 상처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지하철 선로로 내려가 취객을 구하는 등 의로운 일을 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용감한 시민들을 '의사상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의사상자 지원책이 미비해 사회의 귀감인 용감한 시민들이 고통속에 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윤정용씨는 이 길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10여 년 전 이곳에서 차에 치일뻔한 초등학생 2명을 구하고, 대신 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한 아이는 밀치고, 한 아이는 내가 안고..."
의사상자로 인정받아 당시 정부에서 보상금 250만 원을 받았지만 대부분 병원비로 썼습니다.
무엇보다 가장인 윤씨가 다리를 다쳐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인터뷰> 윤정용(의사상자) : "살길이 막연하니까, 나는 나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흩어진 거죠. 노동력을 상실하니까 가정도 파탄된 거죠."
윤씨처럼 의로운 일을 하다 다치거나 숨진 사람들에게 정부는 급수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의료와 취업, 자녀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절실한 취업 지원은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이렇다보니 대부분은 실업자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인터뷰> 김명득(의사상자) : "박스도 줍고, 고철도 줍고 해서... 하루에 많이 벌면 돈 만원도 벌고 못 벌 땐 몇 천원도 못 벌고..."
지난 1970년 의사상자 지원법이 마련된 이후 남을 구하려다 다친 사람은 222명, 사망한 사람도 4백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겉도는 지원책에 용감한 시민들의 상처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많이 본 뉴스
각 플랫폼 별 많이 본 기사 (최근 1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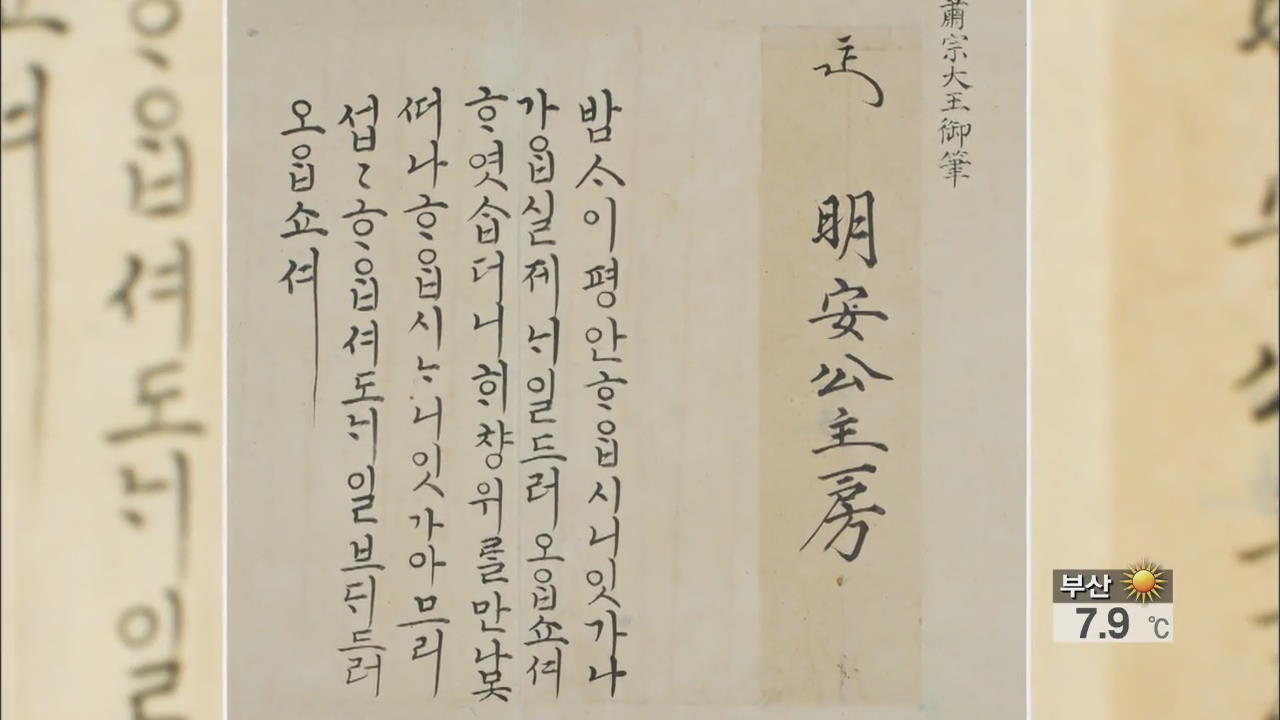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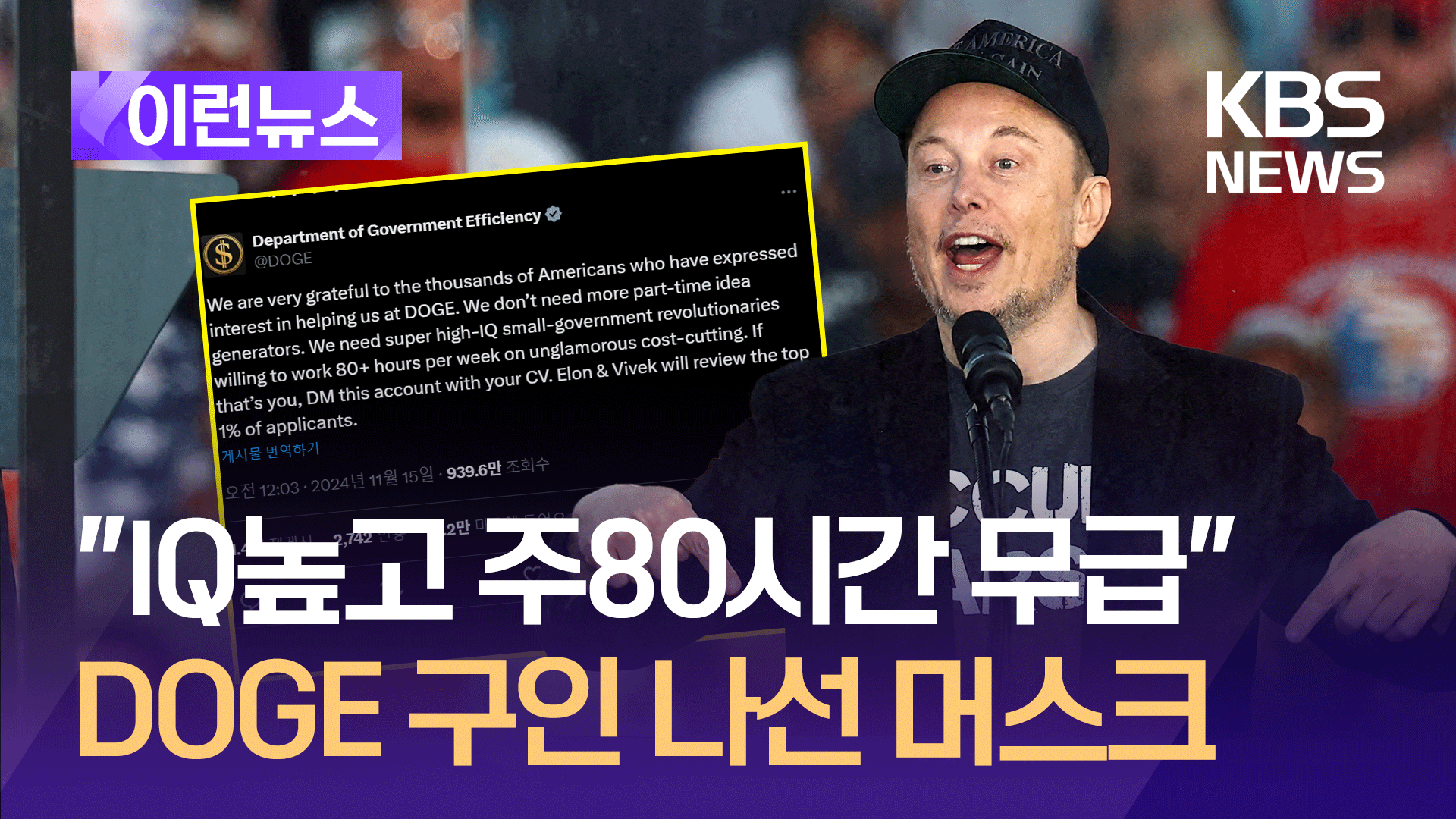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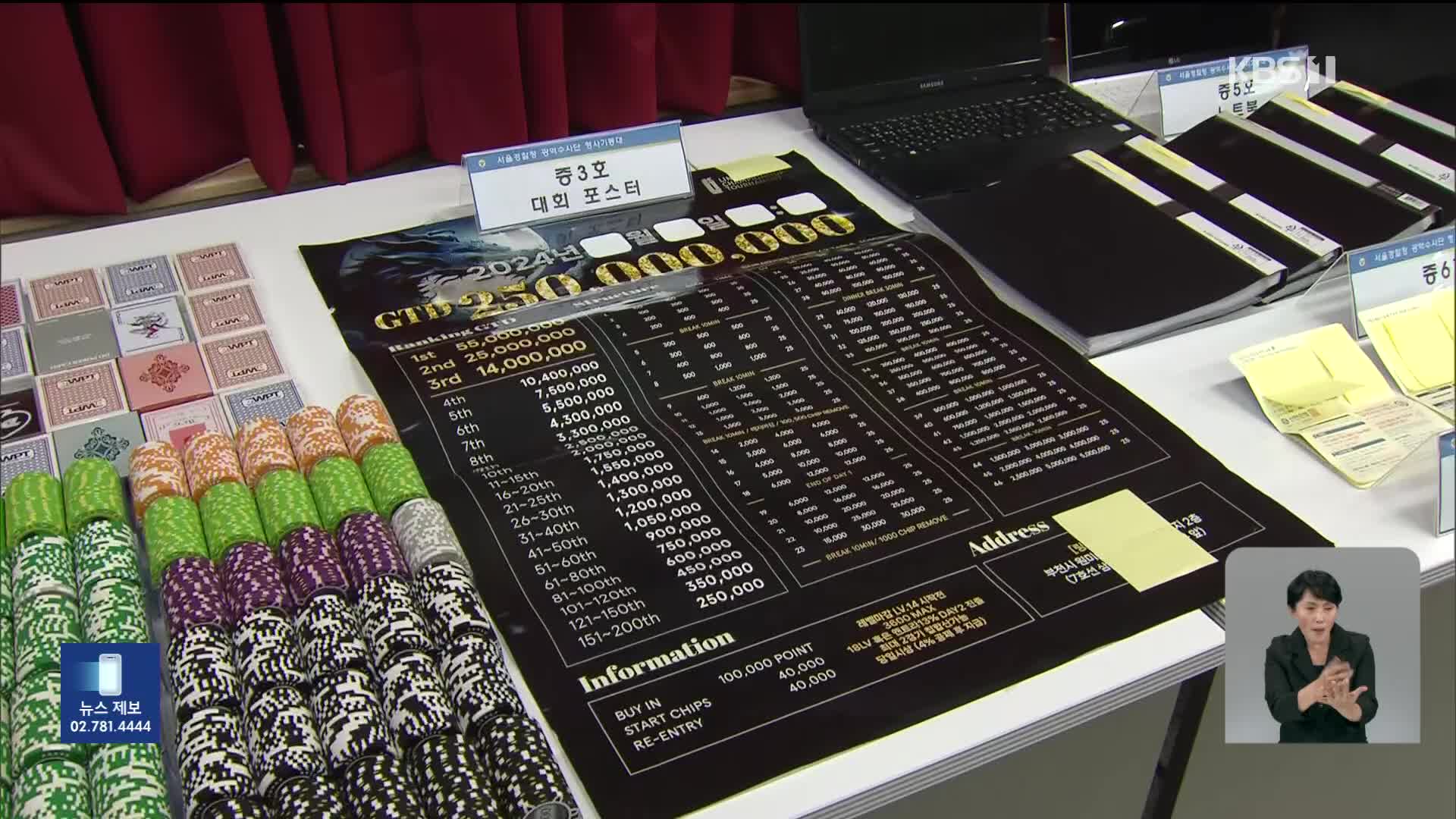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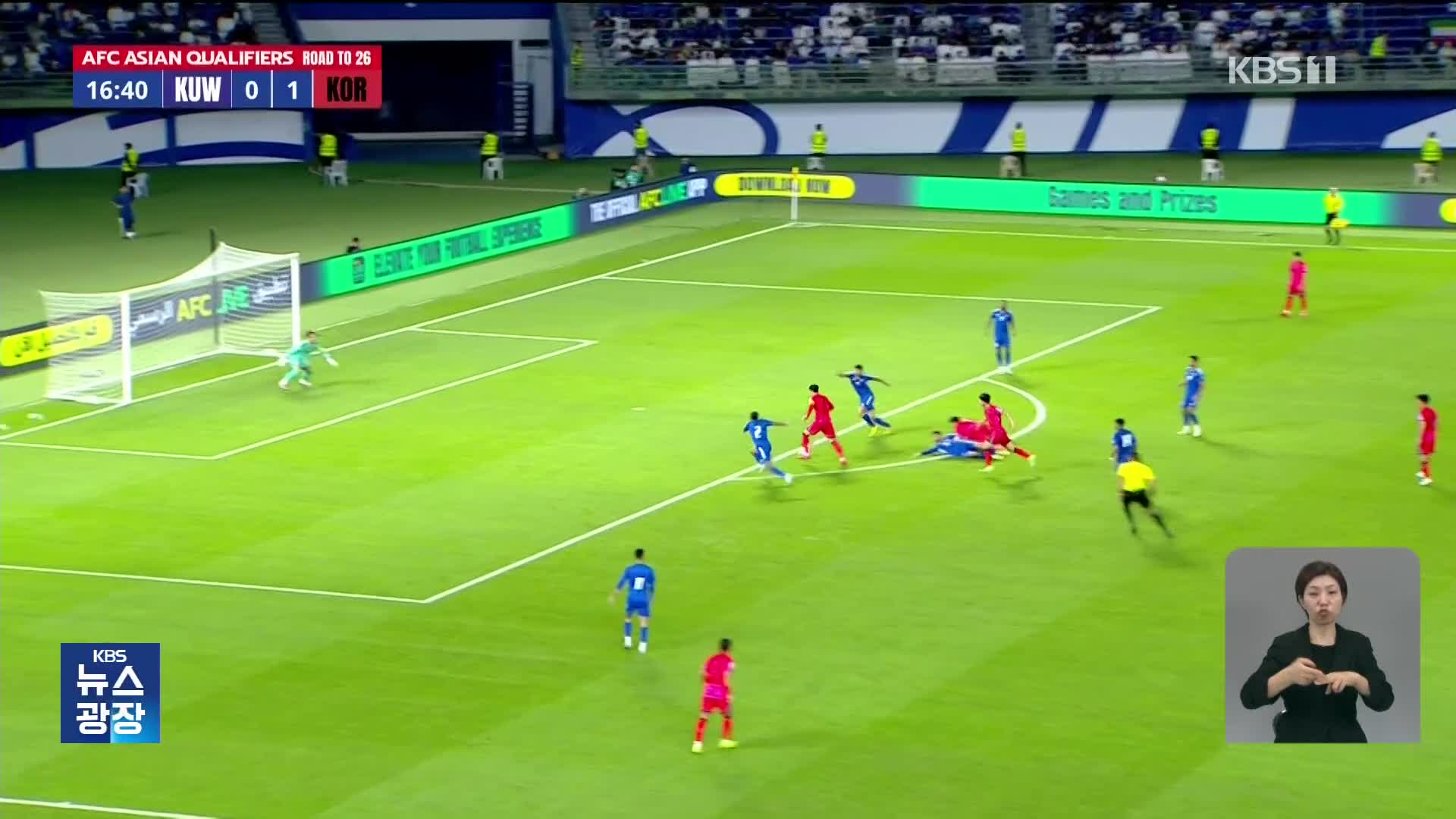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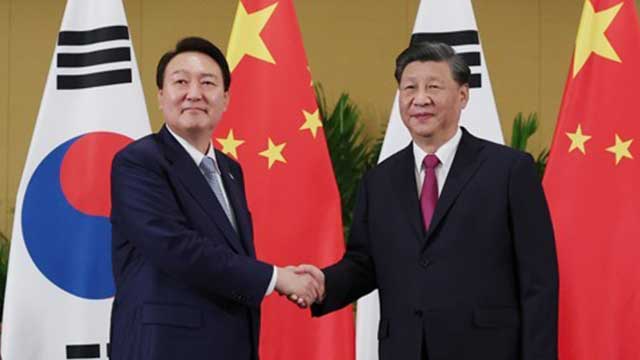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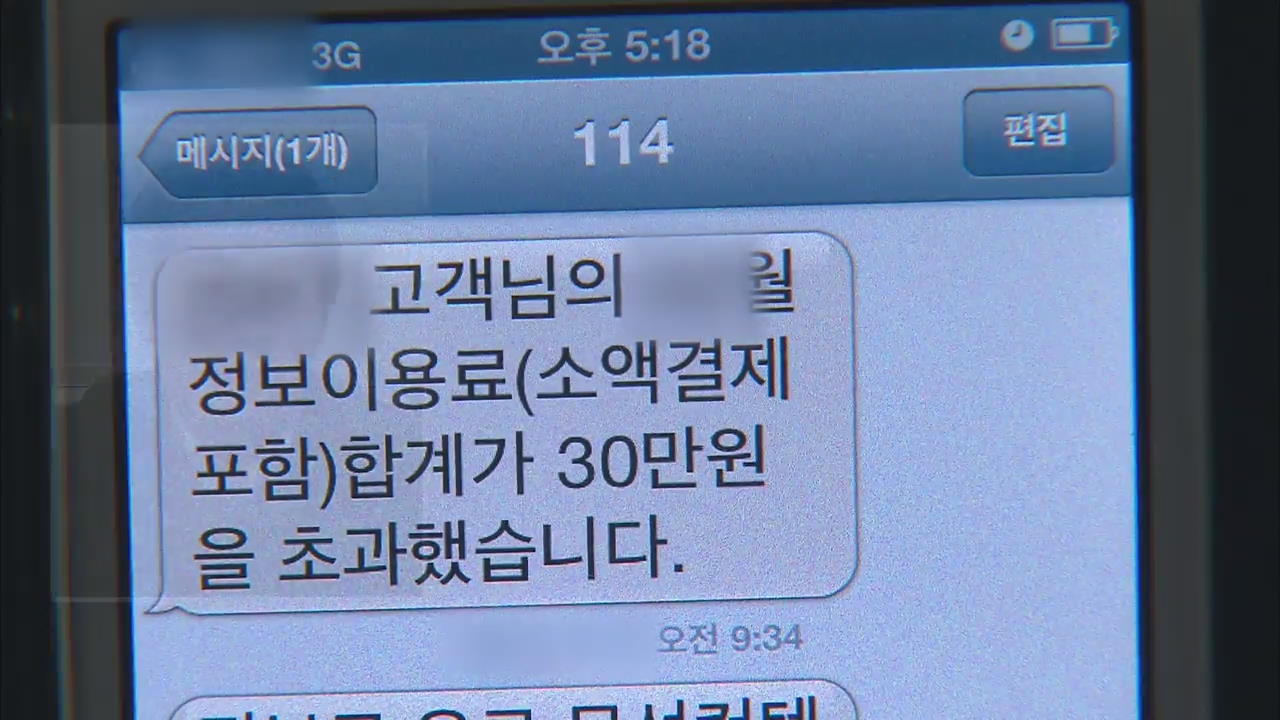
![[연예수첩] 유부녀 맞아? 최강 몸매 미시 스타](/data/news/2013/04/10/2640755_abY.jpg)

![[뉴스따라잡기] ‘쌍꺼풀 수술’ 받던 여대생, 8일 만에 숨져](/data/news/2013/03/29/2634599_12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