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 징계’ 메이저리그, 약물과의 전쟁
입력 2013.08.06 (10:55)
수정 2013.08.06 (11:57)
안내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내용
요약 내용은 네이버 CLOVA Summary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6일(한국시간) 최고연봉 선수인 알렉스 로드리게스(뉴욕 양키스)를 포함한 13명의 선수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리면서 '약물과의 전쟁'도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현재와 같은 도핑의 개념이 확립된 지는 10여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짧은 기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대형 스캔들이 끊임없이 터져 주변의 시선을 싸늘하게 만들었다.
오랫동안 메이저리그에서는 선수들이 근력강화제 등을 복용하는 것을 제재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1998년 70개의 홈런 기록을 세운 마크 맥과이어가 남성 호르몬제의 일종인 안드로스텐다이온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도핑이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도 금지약물 복용을 비난하는 등 여론이 나빠지자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2001년 마이너리그에서 무작위 도핑검사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조금씩 범위를 넓히고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정비해 나갔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2002년에는 왕년의 홈런왕 호세 칸세코가 자서전을 통해 메이저리그 선수 대다수가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폭로해 충격을 안겼다.
2003년에는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투수 스티브 베클러가 스프링캠프의 무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숨졌고, 부검 결과 운동능력 증강 효과가 있는 에페드린의 부작용이 사망 원인이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결국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선수노조는 2004년 국제 기준에 맞는 도핑 테스트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그해 말 홈런왕 배리 본즈가 연방대배심에서 테스토스테론이 포함된 연고 형태의 크림을 발랐다고 시인한 것이 폭로되는 등 약물 스캔들은 끝없이 터져나왔다.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선수노조는 점차 징계의 수위를 높여 나가며 대응했다.
2005년 초에는 첫 번째 도핑 적발시 10일간 출전을 정지시키고 네 번째에는 1년으로 단계별 징계안을 고안했다가 거듭 적발 사례가 나오자 같은 해 말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처벌을 강화했다.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 사용이 처음 적발된 선수에게는 50경기 출장 금지 처분이 내려지고 두 번째는 100경기로 늘어난다. 세 번째 적발시에는 영구 추방당한다.
이처럼 강력한 제재안이 마련된 뒤에도 수없이 스캔들이 터져나오면서 감시망을 빠져나가려는 선수들의 수법과 잡아내려는 사무국 사이의 '전쟁'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2007년에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발표한 약물보고서 '미첼 리포트'에서 '로켓맨' 로저 클레멘스를 비롯해 올스타만 31명이 포함된 금지약물 사용 전·현직 메이저리거 80여명의 실명이 공개돼 태풍이 몰아쳤다.
2011년에는 매니 라미레스가 두 번째 도핑 적발로 10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고 잠정 은퇴한 일도 있었다.
그리고 올해 초 선수들의 약물 공급책 노릇을 한 앤서니 보시가 붙잡히면서 다시 한 번 대형 약물사건이 메이저리그를 강타했다.
이번 사건으로 2011년 내셔널리그 최우수선수 라이언 브론이 올 시즌 잔여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고, 뒤이어 이날 로스리게스를 포함한 13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는 사태로 이어졌다.
메이저리그를 호령해 온 슈퍼스타들이 줄줄이 '약물 스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면서 다시 한 번 암흑기가 도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실정이다.
메이저리그에서도 현재와 같은 도핑의 개념이 확립된 지는 10여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짧은 기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대형 스캔들이 끊임없이 터져 주변의 시선을 싸늘하게 만들었다.
오랫동안 메이저리그에서는 선수들이 근력강화제 등을 복용하는 것을 제재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1998년 70개의 홈런 기록을 세운 마크 맥과이어가 남성 호르몬제의 일종인 안드로스텐다이온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도핑이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도 금지약물 복용을 비난하는 등 여론이 나빠지자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2001년 마이너리그에서 무작위 도핑검사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조금씩 범위를 넓히고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정비해 나갔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2002년에는 왕년의 홈런왕 호세 칸세코가 자서전을 통해 메이저리그 선수 대다수가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폭로해 충격을 안겼다.
2003년에는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투수 스티브 베클러가 스프링캠프의 무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숨졌고, 부검 결과 운동능력 증강 효과가 있는 에페드린의 부작용이 사망 원인이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결국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선수노조는 2004년 국제 기준에 맞는 도핑 테스트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그해 말 홈런왕 배리 본즈가 연방대배심에서 테스토스테론이 포함된 연고 형태의 크림을 발랐다고 시인한 것이 폭로되는 등 약물 스캔들은 끝없이 터져나왔다.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선수노조는 점차 징계의 수위를 높여 나가며 대응했다.
2005년 초에는 첫 번째 도핑 적발시 10일간 출전을 정지시키고 네 번째에는 1년으로 단계별 징계안을 고안했다가 거듭 적발 사례가 나오자 같은 해 말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처벌을 강화했다.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 사용이 처음 적발된 선수에게는 50경기 출장 금지 처분이 내려지고 두 번째는 100경기로 늘어난다. 세 번째 적발시에는 영구 추방당한다.
이처럼 강력한 제재안이 마련된 뒤에도 수없이 스캔들이 터져나오면서 감시망을 빠져나가려는 선수들의 수법과 잡아내려는 사무국 사이의 '전쟁'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2007년에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발표한 약물보고서 '미첼 리포트'에서 '로켓맨' 로저 클레멘스를 비롯해 올스타만 31명이 포함된 금지약물 사용 전·현직 메이저리거 80여명의 실명이 공개돼 태풍이 몰아쳤다.
2011년에는 매니 라미레스가 두 번째 도핑 적발로 10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고 잠정 은퇴한 일도 있었다.
그리고 올해 초 선수들의 약물 공급책 노릇을 한 앤서니 보시가 붙잡히면서 다시 한 번 대형 약물사건이 메이저리그를 강타했다.
이번 사건으로 2011년 내셔널리그 최우수선수 라이언 브론이 올 시즌 잔여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고, 뒤이어 이날 로스리게스를 포함한 13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는 사태로 이어졌다.
메이저리그를 호령해 온 슈퍼스타들이 줄줄이 '약물 스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면서 다시 한 번 암흑기가 도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실정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많이 본 뉴스
각 플랫폼 별 많이 본 기사 (최근 1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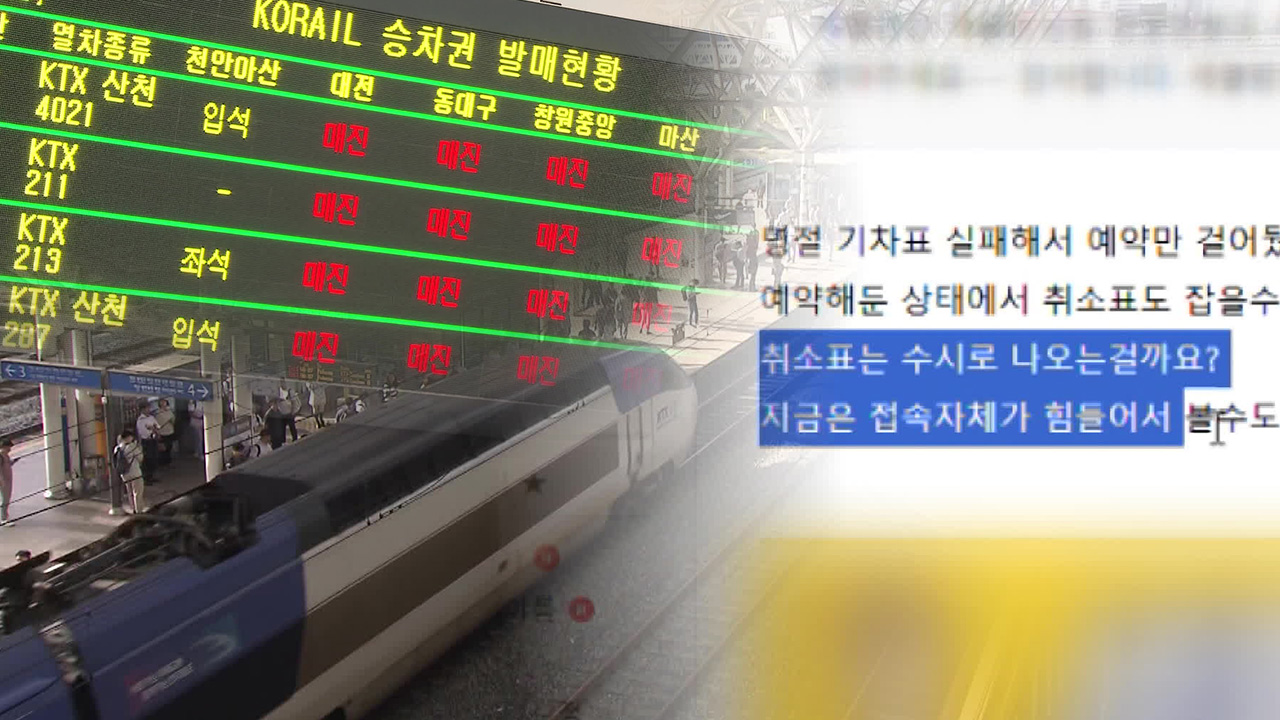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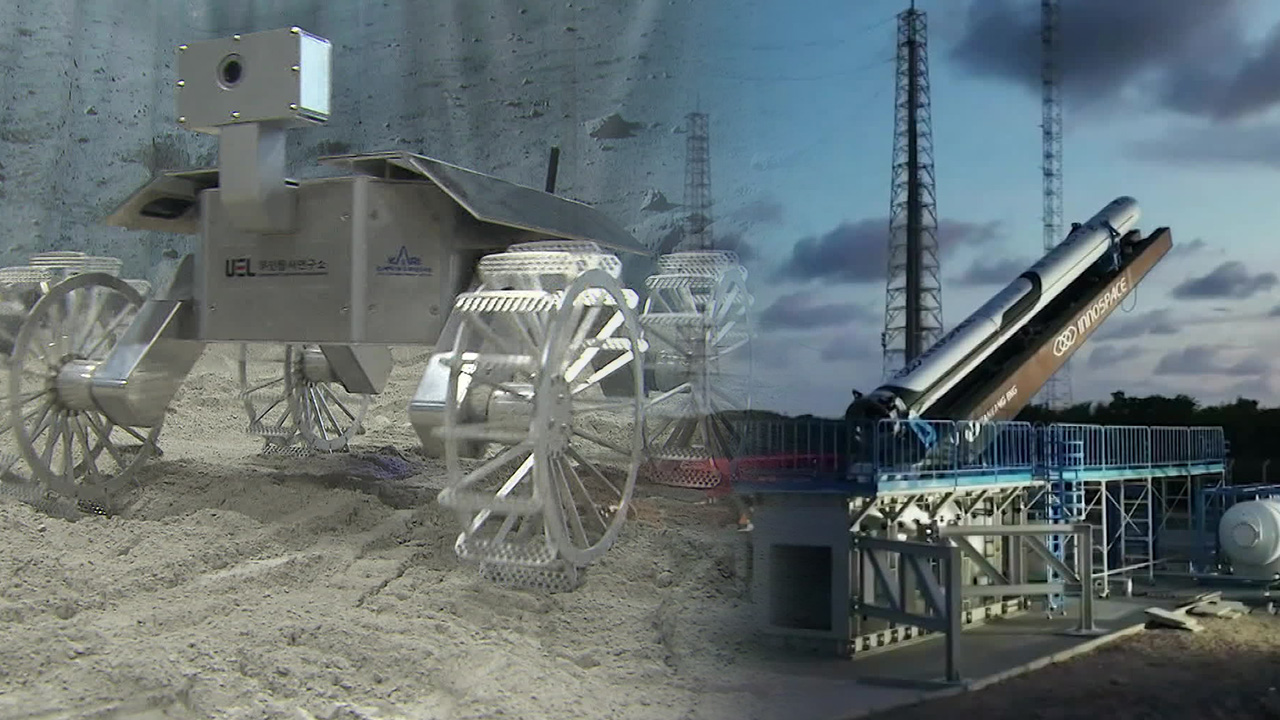



![[영상] ‘오만 쇼크’ 반복되면 진짜 큰일…대표팀, 오만 출국 현장](/data/fckeditor/vod/2024/09/07/kn105391725677343935.png)


![[화제포착] “집 나간 고양이, 이것만 알면 찾아요”](/data/news/2013/07/25/2696845_13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