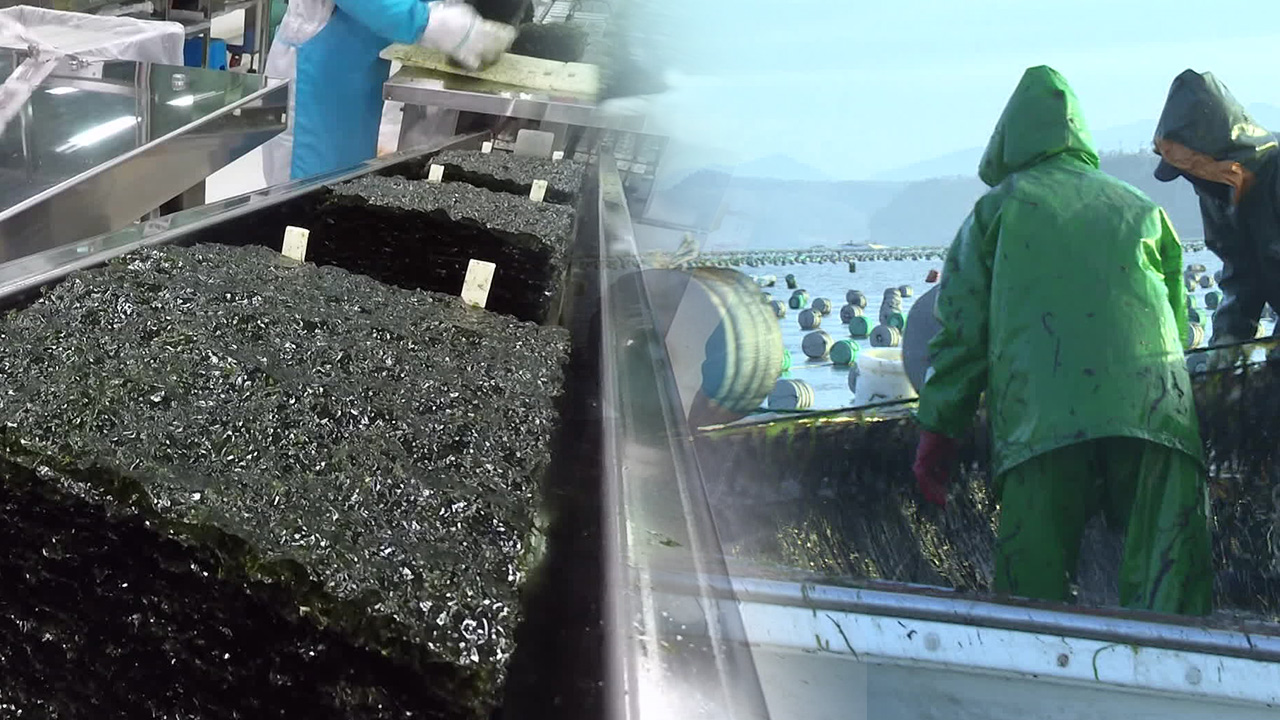‘한때 현상금 걸렸던 소똥구리’…54년 만에 자연으로
입력 2023.09.13 (21:48)
수정 2023.09.14 (07:55)
안내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내용
요약 내용은 네이버 및 OpenAI 社의 AI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앵커]
우리나라에서 사라졌던 소똥구리가 자연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때 소똥구리를 찾기 위해 정부가 현상금을 내걸기도 했는데, 결국 유전적으로 비슷한 소똥구리를 해외에서 들여와 연구와 증식 과정을 거쳐 방사했습니다.
현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짙은 흙색 반죽 속으로 머리를 파묻더니 여섯 개의 다리를 꼼지락거립니다.
어른 손가락 한 마디 크기에 광택이 없는 검은 등딱지의 둥그스름한 이 곤충,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의 '소똥구리'입니다.
[김영중/국립생태원 곤충·무척추동물팀장 : "(지금 밥을 먹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분변 속에 머리를 박고 그 안에서 먹이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똥구리의 마지막 채집 기록은 1969년.
올해 4월에는 국내에서 멸종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소 사육 환경 등이 변한 탓입니다.
[김영중/국립생태원 곤충·무척추동물팀장 : "(방목 방식에서) 축사에서 사육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소똥구리가 서식지에서 사라지게 되었고요. 농약도 충분히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복원을 위해 한때 정부가 수천만 원의 현상금도 걸었지만 실패했습니다.
결국, 지난 2019년을 시작으로 몽골에서 토종과 유전적으로 비슷한 소똥구리 1,000여 마리를 들여와 생태와 증식 연구를 진행했고 개체 일부를 방사했습니다.
["소똥구리야 잘 살아."]
소똥구리가 돌아오기까지 54년이 걸렸습니다.
방사 장소는 소똥구리의 서식에 적합하도록 마련됐습니다.
이렇게 항생제를 먹이지 않는 소를 방목하고, 번식 활동에 쉬운 모래로 구성됐습니다.
'자연의 청소부'라고도 불리는 소똥구리는 메탄을 내뿜거나 하천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소의 분변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땅을 비옥하게 합니다.
국립생태원은 소똥구리가 자연에서 쉽게 증식할 수 있도록 서식환경을 관찰하고, 인간과 공존하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전유진/영상제공:환경부·국립생태원
우리나라에서 사라졌던 소똥구리가 자연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때 소똥구리를 찾기 위해 정부가 현상금을 내걸기도 했는데, 결국 유전적으로 비슷한 소똥구리를 해외에서 들여와 연구와 증식 과정을 거쳐 방사했습니다.
현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짙은 흙색 반죽 속으로 머리를 파묻더니 여섯 개의 다리를 꼼지락거립니다.
어른 손가락 한 마디 크기에 광택이 없는 검은 등딱지의 둥그스름한 이 곤충,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의 '소똥구리'입니다.
[김영중/국립생태원 곤충·무척추동물팀장 : "(지금 밥을 먹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분변 속에 머리를 박고 그 안에서 먹이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똥구리의 마지막 채집 기록은 1969년.
올해 4월에는 국내에서 멸종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소 사육 환경 등이 변한 탓입니다.
[김영중/국립생태원 곤충·무척추동물팀장 : "(방목 방식에서) 축사에서 사육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소똥구리가 서식지에서 사라지게 되었고요. 농약도 충분히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복원을 위해 한때 정부가 수천만 원의 현상금도 걸었지만 실패했습니다.
결국, 지난 2019년을 시작으로 몽골에서 토종과 유전적으로 비슷한 소똥구리 1,000여 마리를 들여와 생태와 증식 연구를 진행했고 개체 일부를 방사했습니다.
["소똥구리야 잘 살아."]
소똥구리가 돌아오기까지 54년이 걸렸습니다.
방사 장소는 소똥구리의 서식에 적합하도록 마련됐습니다.
이렇게 항생제를 먹이지 않는 소를 방목하고, 번식 활동에 쉬운 모래로 구성됐습니다.
'자연의 청소부'라고도 불리는 소똥구리는 메탄을 내뿜거나 하천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소의 분변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땅을 비옥하게 합니다.
국립생태원은 소똥구리가 자연에서 쉽게 증식할 수 있도록 서식환경을 관찰하고, 인간과 공존하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전유진/영상제공:환경부·국립생태원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많이 본 뉴스
각 플랫폼 별 많이 본 기사 (최근 1시간)

![[스포츠9 헤드라인]](https://news.kbs.co.kr/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9/2023/09/13/210_777305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