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살롱] 아니 ‘굿’에도 이런 재미가?
입력 2006.11.01 (09:25)
수정 2006.11.01 (15: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여러분 굿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굿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십 니까?
저는 사극 에서 주로 봐서 그런지 왠지 좀 으스스한 느낌도 있거든요,
네, 저도 왠지 굿 하면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 이 굿을 재평가하 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문화팀 이소정 기자와 알아보죠 이 기자는 굿이 재밌다... 라고 표현하셨네요?
<리포트>
사실 굿은 인간과 신을 연결하는 제사 의식이지만 그 과정을 지켜보면 소리나 무용, 퍼포먼스 등 다양한 예술적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굿을 우리나라 연극, 혹은 민족극의 원형이라고도 하는데요~
'굿'이라는 우리의 민속이 어떤 재미를 지니고 있는지... 하나씩 찾아봤습니다~
<영화 '사이에서' 조상굿>
신을 굿판에 초대하고, 혼을 받아 위로하고...
자연과 하나 되면서 맺힌 것을 풀고, 닫힌 것을 여는 굿판.
이 신명의 과정이 거의 원형 그대로~ 무대 위에 올려졌습니다.
관객들이 모두 한 동네 이웃들이 돼서 그동안 지은 죄를 빌고 성황당을 꾸며 복을 나눕니다.
희곡작가 엄인희의 대표작 <부유도>가 한양굿과 만났는데요~
무대와 객석의 구분은 일찌감치 허물어졌습니다.
<인터뷰>이용이 (예술감독): "끼어들어서 놀기도 하고 같이 춤도 추고... 앉아서 구경하시고 우리는 공연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장르니까 매력..."
떡을 나눠 먹고 한 데 어우러지다 보니~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는 공동체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익숙한 사물놀이는 마을굿에서 흥을 돋우던 풍물에서 유래했습니다.
또 우리 전통음악을 대표하는 '산조'의 기본은 시나위 음악인데요~ 시나위 역시 남도 지방의 무당들이 굿을 할 때 쓰던 음악입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무속이 아니었다면 우리 공연예술 가운데 상당 부분이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란 결론이 나옵니다.
한국 예술종합학교 전통연희과 학생들이 이번 학기 정규수업에서 공부하고 있는 건 동해안 별신굿입니다.
<인터뷰>김정희 (중요무형문화재 제 82가호 이수자):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하더라도 엄두를 못 냈죠. 요즘은 좋은 선생님들을 불러다가 학생들에게 전수시키니까 굉장히 고맙죠,"
학생들 대부분이 풍물을 공부한 지 10년씩은 되는 베테랑들인데요~
무속 장단은 3박자, 5박자... 홀수로 진행되기 때문에 강약의 맛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또 그만큼 매력 있다고들 하더라구요~
<인터뷰>예종 학생: "학교 들어와서 동해안 별싯굿, 진도 씻김굿, 경기 도당굿 이런 거 배우다보니까 더 많이 알고 싶고 그리고 장단에 대해 꽤 뚫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 같아요."
한국 무용의 산증인이죠, 김백봉 선생의 대표작, 광란의 제단입니다.
사람의 혼을 뒤흔들어 환희까지 끌고 가는 굿판의 과정에 신무용으로 세련된 맛을 더했습니다.
<인터뷰>김백봉: "심리 변화를 약동적으로 표현해서 뛰는 동작같은 것이..발랄하고 ..요새 감각에도 맞고 미래에도 맞을 거라 생각했어요~"
굿은 우리 조상의 시간과 함께했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소중한 풍속입니다. 오늘의 느낌으로 되살리려는 노력이 아름다운 이윱니다.
여러분 굿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굿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십 니까?
저는 사극 에서 주로 봐서 그런지 왠지 좀 으스스한 느낌도 있거든요,
네, 저도 왠지 굿 하면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 이 굿을 재평가하 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문화팀 이소정 기자와 알아보죠 이 기자는 굿이 재밌다... 라고 표현하셨네요?
<리포트>
사실 굿은 인간과 신을 연결하는 제사 의식이지만 그 과정을 지켜보면 소리나 무용, 퍼포먼스 등 다양한 예술적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굿을 우리나라 연극, 혹은 민족극의 원형이라고도 하는데요~
'굿'이라는 우리의 민속이 어떤 재미를 지니고 있는지... 하나씩 찾아봤습니다~
<영화 '사이에서' 조상굿>
신을 굿판에 초대하고, 혼을 받아 위로하고...
자연과 하나 되면서 맺힌 것을 풀고, 닫힌 것을 여는 굿판.
이 신명의 과정이 거의 원형 그대로~ 무대 위에 올려졌습니다.
관객들이 모두 한 동네 이웃들이 돼서 그동안 지은 죄를 빌고 성황당을 꾸며 복을 나눕니다.
희곡작가 엄인희의 대표작 <부유도>가 한양굿과 만났는데요~
무대와 객석의 구분은 일찌감치 허물어졌습니다.
<인터뷰>이용이 (예술감독): "끼어들어서 놀기도 하고 같이 춤도 추고... 앉아서 구경하시고 우리는 공연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장르니까 매력..."
떡을 나눠 먹고 한 데 어우러지다 보니~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는 공동체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익숙한 사물놀이는 마을굿에서 흥을 돋우던 풍물에서 유래했습니다.
또 우리 전통음악을 대표하는 '산조'의 기본은 시나위 음악인데요~ 시나위 역시 남도 지방의 무당들이 굿을 할 때 쓰던 음악입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무속이 아니었다면 우리 공연예술 가운데 상당 부분이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란 결론이 나옵니다.
한국 예술종합학교 전통연희과 학생들이 이번 학기 정규수업에서 공부하고 있는 건 동해안 별신굿입니다.
<인터뷰>김정희 (중요무형문화재 제 82가호 이수자):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하더라도 엄두를 못 냈죠. 요즘은 좋은 선생님들을 불러다가 학생들에게 전수시키니까 굉장히 고맙죠,"
학생들 대부분이 풍물을 공부한 지 10년씩은 되는 베테랑들인데요~
무속 장단은 3박자, 5박자... 홀수로 진행되기 때문에 강약의 맛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또 그만큼 매력 있다고들 하더라구요~
<인터뷰>예종 학생: "학교 들어와서 동해안 별싯굿, 진도 씻김굿, 경기 도당굿 이런 거 배우다보니까 더 많이 알고 싶고 그리고 장단에 대해 꽤 뚫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 같아요."
한국 무용의 산증인이죠, 김백봉 선생의 대표작, 광란의 제단입니다.
사람의 혼을 뒤흔들어 환희까지 끌고 가는 굿판의 과정에 신무용으로 세련된 맛을 더했습니다.
<인터뷰>김백봉: "심리 변화를 약동적으로 표현해서 뛰는 동작같은 것이..발랄하고 ..요새 감각에도 맞고 미래에도 맞을 거라 생각했어요~"
굿은 우리 조상의 시간과 함께했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소중한 풍속입니다. 오늘의 느낌으로 되살리려는 노력이 아름다운 이윱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문화살롱] 아니 ‘굿’에도 이런 재미가?
-
- 입력 2006-11-01 08:07:27
- 수정2006-11-01 15:22:59

<앵커 멘트>
여러분 굿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굿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십 니까?
저는 사극 에서 주로 봐서 그런지 왠지 좀 으스스한 느낌도 있거든요,
네, 저도 왠지 굿 하면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 이 굿을 재평가하 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문화팀 이소정 기자와 알아보죠 이 기자는 굿이 재밌다... 라고 표현하셨네요?
<리포트>
사실 굿은 인간과 신을 연결하는 제사 의식이지만 그 과정을 지켜보면 소리나 무용, 퍼포먼스 등 다양한 예술적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굿을 우리나라 연극, 혹은 민족극의 원형이라고도 하는데요~
'굿'이라는 우리의 민속이 어떤 재미를 지니고 있는지... 하나씩 찾아봤습니다~
<영화 '사이에서' 조상굿>
신을 굿판에 초대하고, 혼을 받아 위로하고...
자연과 하나 되면서 맺힌 것을 풀고, 닫힌 것을 여는 굿판.
이 신명의 과정이 거의 원형 그대로~ 무대 위에 올려졌습니다.
관객들이 모두 한 동네 이웃들이 돼서 그동안 지은 죄를 빌고 성황당을 꾸며 복을 나눕니다.
희곡작가 엄인희의 대표작 <부유도>가 한양굿과 만났는데요~
무대와 객석의 구분은 일찌감치 허물어졌습니다.
<인터뷰>이용이 (예술감독): "끼어들어서 놀기도 하고 같이 춤도 추고... 앉아서 구경하시고 우리는 공연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장르니까 매력..."
떡을 나눠 먹고 한 데 어우러지다 보니~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는 공동체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익숙한 사물놀이는 마을굿에서 흥을 돋우던 풍물에서 유래했습니다.
또 우리 전통음악을 대표하는 '산조'의 기본은 시나위 음악인데요~ 시나위 역시 남도 지방의 무당들이 굿을 할 때 쓰던 음악입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무속이 아니었다면 우리 공연예술 가운데 상당 부분이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란 결론이 나옵니다.
한국 예술종합학교 전통연희과 학생들이 이번 학기 정규수업에서 공부하고 있는 건 동해안 별신굿입니다.
<인터뷰>김정희 (중요무형문화재 제 82가호 이수자):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하더라도 엄두를 못 냈죠. 요즘은 좋은 선생님들을 불러다가 학생들에게 전수시키니까 굉장히 고맙죠,"
학생들 대부분이 풍물을 공부한 지 10년씩은 되는 베테랑들인데요~
무속 장단은 3박자, 5박자... 홀수로 진행되기 때문에 강약의 맛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또 그만큼 매력 있다고들 하더라구요~
<인터뷰>예종 학생: "학교 들어와서 동해안 별싯굿, 진도 씻김굿, 경기 도당굿 이런 거 배우다보니까 더 많이 알고 싶고 그리고 장단에 대해 꽤 뚫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 같아요."
한국 무용의 산증인이죠, 김백봉 선생의 대표작, 광란의 제단입니다.
사람의 혼을 뒤흔들어 환희까지 끌고 가는 굿판의 과정에 신무용으로 세련된 맛을 더했습니다.
<인터뷰>김백봉: "심리 변화를 약동적으로 표현해서 뛰는 동작같은 것이..발랄하고 ..요새 감각에도 맞고 미래에도 맞을 거라 생각했어요~"
굿은 우리 조상의 시간과 함께했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소중한 풍속입니다. 오늘의 느낌으로 되살리려는 노력이 아름다운 이윱니다.
-
-

이소정 기자 sojeong2@kbs.co.kr
이소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뉴스클릭]오늘 외교·안보 라인 개각 外](https://news.kbs.co.kr/newsimage2/200611/20061101/1244820.jpg)
![[세계는 지금] 英 줄기세포 이용 인공 간 첫 배양 外](https://news.kbs.co.kr/newsimage2/200611/20061101/124482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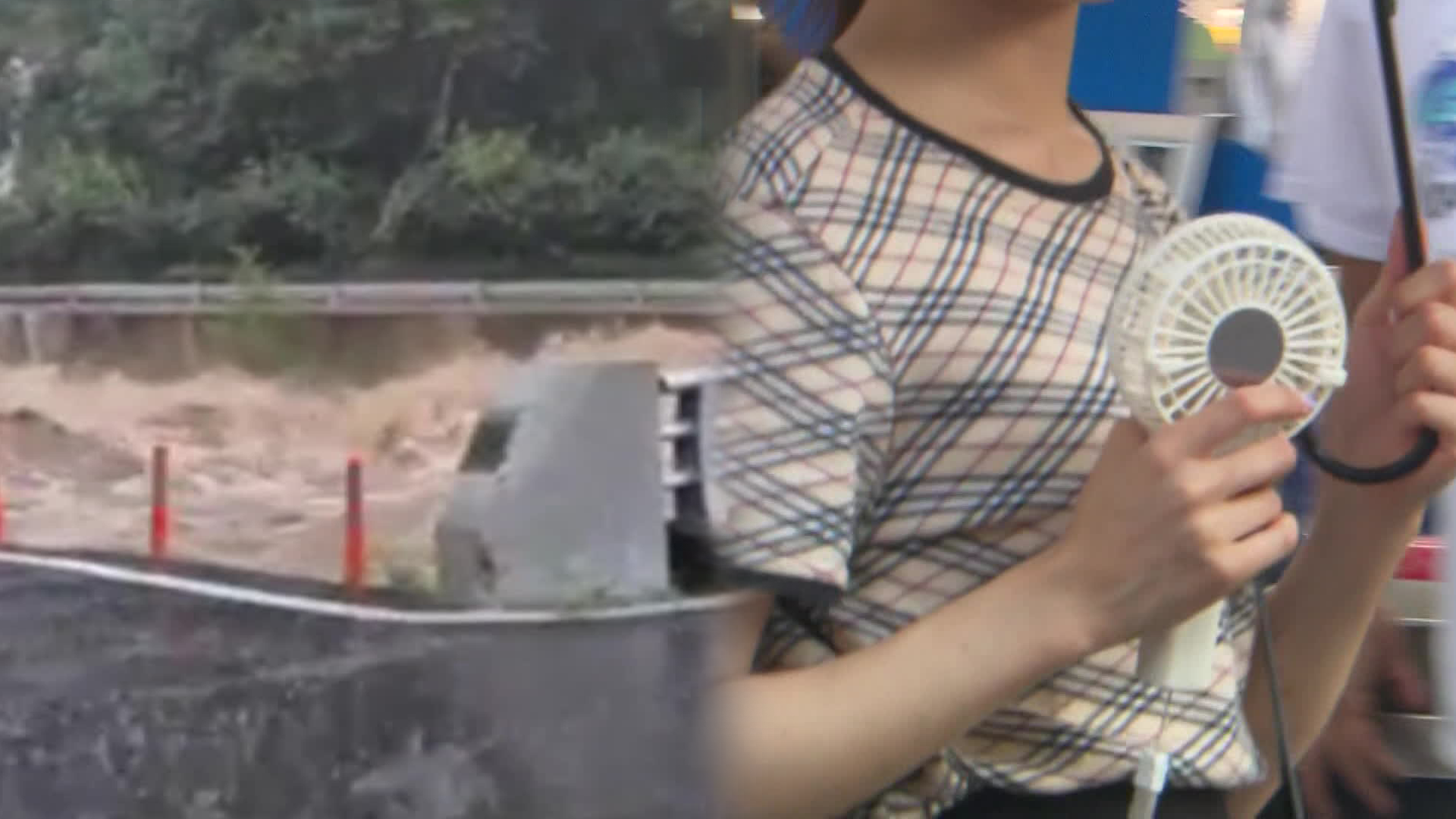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