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잘린’ 황현주, 명장의 비결은?
입력 2010.01.02 (08:27)
수정 2010.01.02 (08: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 시즌 프로배구 여자부 최강팀으로 거듭난 현대건설의 황현주(44) 감독은 정규 시즌 1위를 달리다 두 번이나 흥국생명에서 잘린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그를 자를 때 흥국생명은 ’승부에만 집착한 나머지 구단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설명해 배구팬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했다.
’우승 청부사’, ’독사’ 등 별명에서 알 수 있듯 그에게는 강하다는 이미지가 꼬리표처럼 붙어 있다.
모기업이 건설회사인 현대건설 배구단마저 그의 강한 이미지가 부담스러워 감독으로 뽑아야 할지 망설였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황 감독이 새 사령탑으로 부임한 현대건설은 1일 현재 10승1패로 여자부 선두를 달리고 있다.
2008-2009시즌 5개 팀 중 4위, 그전 해는 꼴찌였던 팀이 별다른 전력 보강 없이 1위로 껑충 뛰어오른 것이다.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현대건설여자배구단 체육관에서 황 감독을 만나 그 비결을 들었다.
◇키가 커 시작한 배구..키에 발목잡히다
경남 하동군 악양초등학교 3학년 때 또래보다 키가 크다는 이유 하나로 처음 배구공을 만졌다.
진주시로 이사해서도 배구를 계속해 동명중학교에 들어갔으나 생각만큼 성장하지 않은 키 때문에 배구를 그만둬야 하나 고민했다.
다행히 중3, 고1 때 지금 키인 179㎝까지 자랐으나 세터로도 작은 키는 결국 선수 생활 내내 그의 발목을 잡았다.
1987년 LIG 손해보험의 전신인 금성에 입단했으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2년 정도 주전으로 뛰다 최영준(현 LIG 손보 코치)에게 밀려 백업 세터로 내려갔고 국가대표 유니폼도 한 번 입어보지 못한 채 1994년 은퇴했다.
그는 당시를 떠올리며 "신영철 씨 등 쟁쟁한 세터들이 활동했던 시기였고 작은 키라는 약점을 가진 나로서는 남들보다 배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선수로 살아남기 어려웠다"며 "그렇지만 팀에서 내 역할이 있었고 만족스럽게 했다"고 회상했다.
◇"두 번째 잘렸을 땐 내 삶을 돌이켜봤다"
1995년 호남정유 여자배구단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그는 한일전산여고 감독을 거쳐 2002년 흥국생명 코치로 들어간 뒤 이듬해 10월 37세의 젊은 나이에 프로배구 감독 자리에 올랐다.
프로배구 출범 원년인 2005 V리그에서 불과 3승(13패)만을 올리며 꼴찌로 처지기도 했지만 가장 큰 시련은 2006년 2월 찾아왔다.
흥국생명은 당시 김연경과 황연주라는 막강 공격수를 앞세워 정규리그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우승에 갈증을 느끼던 구단이 갑자기 호남정유 92연승 신화를 이끈 우승청부사 김철용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들인 것이었다.
"그때 기분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날벼락 맞은 기분이라고나 할까"
충격이 컸던 황 감독은 진주로 돌아가 두 달가량 술에 빠져 살았다.
하지만 흥국생명은 그 해 12월 다시 김 감독을 해임하고 황 감독을 불러올렸다.
"흥국생명의 제안을 받고 망설였지만 함께 어려움을 나눴던 선수들과 우승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슴속에 차 있어서 수락했다"고 말했다.
2006-2007시즌 흥국생명은 통합 챔피언에 오르면서 황 감독은 우승 감독의 소원을 풀었다.
그러나 2008년 12월 흥국생명이 1위를 달리던 중 승부에 집착해 구단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또 한 번 잘렸다.
황 감독은 "구단에서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다른 사정이 있었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두 번째 해고 때는 더는 망가질 것도 없단 생각에 나 자신을 돌이켜봤고 실력을 키우고자 외국에서 지도자 연수를 받을 생각을 했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자신이 키운 선수들이 2008-2009시즌 챔피언이 되는 순간도 같이하지 못하고 TV로 지켜보면서 박수를 보내야 했다.
성적이 부진했던 다른 구단들은 해고당한 황 감독에 눈독을 들였다.
현대건설에서 감독 제의가 있었고 지난해 5월 새로 감독으로 뽑히면서 또 한 번 도전을 시작했다.
◇"프로는 1등만 기억한다"
감독으로 선정된 뒤 만난 현대건설 선수들에게는 하위팀의 무기력함이 배어 있었다.
패배의식에 빠져 자신감이 없었을 뿐 아니라 운동에 재미를 못 느꼈다.
황 감독은 훈련보다는 선수 생각을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코치나 트레이너도 뽑지 않고 혼자서 한 달 동안 선수들과 대화하며 훈련했다.
"스포츠에 2등은 없다"는 철학을 가진 황 감독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왜 배구를 하는지, 잘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면서 자신감을 불어넣었다"고 설명했다.
경기에서 당연히 이겨야 하지만 비록 지더라도 팬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립박수를 받는 플레이를 펼친다면 이길 가능성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런 생각은 경기와 연습 때만큼은 느슨함 없는 열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에게는 자연스레 독하다는 이미지가 따라붙었다.
그렇다고 황 감독이 스파르타식 훈련만을 강요하진 않는다.
"선수들이 스스로 목표 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데 더 힘을 기울인다"고 강조했다.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 아니라는 황 감독의 이력은 과거 자신의 처지에 비추어 어려운 선수나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선수와 조직력에 좀 더 관심을 두도록 했다.
그는 "흥국생명 때 김연경, 황연주, 현대건설에서는 케니가 활약을 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선수가 공격하도록 몸을 던져 수비하고 공을 올려주는 이들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하다"며 조직력을 강조한다.
황 감독은 지금 맡은 지 불과 반년 남짓밖에 안 된 현대건설을 정상에 올려놓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다.
"작년보다 선수들이 해 내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페이스로만 해준다면 성적이 잘 나올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를 자를 때 흥국생명은 ’승부에만 집착한 나머지 구단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설명해 배구팬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했다.
’우승 청부사’, ’독사’ 등 별명에서 알 수 있듯 그에게는 강하다는 이미지가 꼬리표처럼 붙어 있다.
모기업이 건설회사인 현대건설 배구단마저 그의 강한 이미지가 부담스러워 감독으로 뽑아야 할지 망설였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황 감독이 새 사령탑으로 부임한 현대건설은 1일 현재 10승1패로 여자부 선두를 달리고 있다.
2008-2009시즌 5개 팀 중 4위, 그전 해는 꼴찌였던 팀이 별다른 전력 보강 없이 1위로 껑충 뛰어오른 것이다.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현대건설여자배구단 체육관에서 황 감독을 만나 그 비결을 들었다.
◇키가 커 시작한 배구..키에 발목잡히다
경남 하동군 악양초등학교 3학년 때 또래보다 키가 크다는 이유 하나로 처음 배구공을 만졌다.
진주시로 이사해서도 배구를 계속해 동명중학교에 들어갔으나 생각만큼 성장하지 않은 키 때문에 배구를 그만둬야 하나 고민했다.
다행히 중3, 고1 때 지금 키인 179㎝까지 자랐으나 세터로도 작은 키는 결국 선수 생활 내내 그의 발목을 잡았다.
1987년 LIG 손해보험의 전신인 금성에 입단했으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2년 정도 주전으로 뛰다 최영준(현 LIG 손보 코치)에게 밀려 백업 세터로 내려갔고 국가대표 유니폼도 한 번 입어보지 못한 채 1994년 은퇴했다.
그는 당시를 떠올리며 "신영철 씨 등 쟁쟁한 세터들이 활동했던 시기였고 작은 키라는 약점을 가진 나로서는 남들보다 배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선수로 살아남기 어려웠다"며 "그렇지만 팀에서 내 역할이 있었고 만족스럽게 했다"고 회상했다.
◇"두 번째 잘렸을 땐 내 삶을 돌이켜봤다"
1995년 호남정유 여자배구단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그는 한일전산여고 감독을 거쳐 2002년 흥국생명 코치로 들어간 뒤 이듬해 10월 37세의 젊은 나이에 프로배구 감독 자리에 올랐다.
프로배구 출범 원년인 2005 V리그에서 불과 3승(13패)만을 올리며 꼴찌로 처지기도 했지만 가장 큰 시련은 2006년 2월 찾아왔다.
흥국생명은 당시 김연경과 황연주라는 막강 공격수를 앞세워 정규리그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우승에 갈증을 느끼던 구단이 갑자기 호남정유 92연승 신화를 이끈 우승청부사 김철용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들인 것이었다.
"그때 기분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날벼락 맞은 기분이라고나 할까"
충격이 컸던 황 감독은 진주로 돌아가 두 달가량 술에 빠져 살았다.
하지만 흥국생명은 그 해 12월 다시 김 감독을 해임하고 황 감독을 불러올렸다.
"흥국생명의 제안을 받고 망설였지만 함께 어려움을 나눴던 선수들과 우승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슴속에 차 있어서 수락했다"고 말했다.
2006-2007시즌 흥국생명은 통합 챔피언에 오르면서 황 감독은 우승 감독의 소원을 풀었다.
그러나 2008년 12월 흥국생명이 1위를 달리던 중 승부에 집착해 구단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또 한 번 잘렸다.
황 감독은 "구단에서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다른 사정이 있었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두 번째 해고 때는 더는 망가질 것도 없단 생각에 나 자신을 돌이켜봤고 실력을 키우고자 외국에서 지도자 연수를 받을 생각을 했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자신이 키운 선수들이 2008-2009시즌 챔피언이 되는 순간도 같이하지 못하고 TV로 지켜보면서 박수를 보내야 했다.
성적이 부진했던 다른 구단들은 해고당한 황 감독에 눈독을 들였다.
현대건설에서 감독 제의가 있었고 지난해 5월 새로 감독으로 뽑히면서 또 한 번 도전을 시작했다.
◇"프로는 1등만 기억한다"
감독으로 선정된 뒤 만난 현대건설 선수들에게는 하위팀의 무기력함이 배어 있었다.
패배의식에 빠져 자신감이 없었을 뿐 아니라 운동에 재미를 못 느꼈다.
황 감독은 훈련보다는 선수 생각을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코치나 트레이너도 뽑지 않고 혼자서 한 달 동안 선수들과 대화하며 훈련했다.
"스포츠에 2등은 없다"는 철학을 가진 황 감독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왜 배구를 하는지, 잘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면서 자신감을 불어넣었다"고 설명했다.
경기에서 당연히 이겨야 하지만 비록 지더라도 팬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립박수를 받는 플레이를 펼친다면 이길 가능성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런 생각은 경기와 연습 때만큼은 느슨함 없는 열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에게는 자연스레 독하다는 이미지가 따라붙었다.
그렇다고 황 감독이 스파르타식 훈련만을 강요하진 않는다.
"선수들이 스스로 목표 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데 더 힘을 기울인다"고 강조했다.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 아니라는 황 감독의 이력은 과거 자신의 처지에 비추어 어려운 선수나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선수와 조직력에 좀 더 관심을 두도록 했다.
그는 "흥국생명 때 김연경, 황연주, 현대건설에서는 케니가 활약을 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선수가 공격하도록 몸을 던져 수비하고 공을 올려주는 이들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하다"며 조직력을 강조한다.
황 감독은 지금 맡은 지 불과 반년 남짓밖에 안 된 현대건설을 정상에 올려놓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다.
"작년보다 선수들이 해 내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페이스로만 해준다면 성적이 잘 나올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2번 잘린’ 황현주, 명장의 비결은?
-
- 입력 2010-01-02 08:27:25
- 수정2010-01-02 08:33:12

올 시즌 프로배구 여자부 최강팀으로 거듭난 현대건설의 황현주(44) 감독은 정규 시즌 1위를 달리다 두 번이나 흥국생명에서 잘린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그를 자를 때 흥국생명은 ’승부에만 집착한 나머지 구단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설명해 배구팬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했다.
’우승 청부사’, ’독사’ 등 별명에서 알 수 있듯 그에게는 강하다는 이미지가 꼬리표처럼 붙어 있다.
모기업이 건설회사인 현대건설 배구단마저 그의 강한 이미지가 부담스러워 감독으로 뽑아야 할지 망설였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황 감독이 새 사령탑으로 부임한 현대건설은 1일 현재 10승1패로 여자부 선두를 달리고 있다.
2008-2009시즌 5개 팀 중 4위, 그전 해는 꼴찌였던 팀이 별다른 전력 보강 없이 1위로 껑충 뛰어오른 것이다.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현대건설여자배구단 체육관에서 황 감독을 만나 그 비결을 들었다.
◇키가 커 시작한 배구..키에 발목잡히다
경남 하동군 악양초등학교 3학년 때 또래보다 키가 크다는 이유 하나로 처음 배구공을 만졌다.
진주시로 이사해서도 배구를 계속해 동명중학교에 들어갔으나 생각만큼 성장하지 않은 키 때문에 배구를 그만둬야 하나 고민했다.
다행히 중3, 고1 때 지금 키인 179㎝까지 자랐으나 세터로도 작은 키는 결국 선수 생활 내내 그의 발목을 잡았다.
1987년 LIG 손해보험의 전신인 금성에 입단했으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2년 정도 주전으로 뛰다 최영준(현 LIG 손보 코치)에게 밀려 백업 세터로 내려갔고 국가대표 유니폼도 한 번 입어보지 못한 채 1994년 은퇴했다.
그는 당시를 떠올리며 "신영철 씨 등 쟁쟁한 세터들이 활동했던 시기였고 작은 키라는 약점을 가진 나로서는 남들보다 배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선수로 살아남기 어려웠다"며 "그렇지만 팀에서 내 역할이 있었고 만족스럽게 했다"고 회상했다.
◇"두 번째 잘렸을 땐 내 삶을 돌이켜봤다"
1995년 호남정유 여자배구단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그는 한일전산여고 감독을 거쳐 2002년 흥국생명 코치로 들어간 뒤 이듬해 10월 37세의 젊은 나이에 프로배구 감독 자리에 올랐다.
프로배구 출범 원년인 2005 V리그에서 불과 3승(13패)만을 올리며 꼴찌로 처지기도 했지만 가장 큰 시련은 2006년 2월 찾아왔다.
흥국생명은 당시 김연경과 황연주라는 막강 공격수를 앞세워 정규리그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우승에 갈증을 느끼던 구단이 갑자기 호남정유 92연승 신화를 이끈 우승청부사 김철용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들인 것이었다.
"그때 기분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날벼락 맞은 기분이라고나 할까"
충격이 컸던 황 감독은 진주로 돌아가 두 달가량 술에 빠져 살았다.
하지만 흥국생명은 그 해 12월 다시 김 감독을 해임하고 황 감독을 불러올렸다.
"흥국생명의 제안을 받고 망설였지만 함께 어려움을 나눴던 선수들과 우승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슴속에 차 있어서 수락했다"고 말했다.
2006-2007시즌 흥국생명은 통합 챔피언에 오르면서 황 감독은 우승 감독의 소원을 풀었다.
그러나 2008년 12월 흥국생명이 1위를 달리던 중 승부에 집착해 구단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또 한 번 잘렸다.
황 감독은 "구단에서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다른 사정이 있었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두 번째 해고 때는 더는 망가질 것도 없단 생각에 나 자신을 돌이켜봤고 실력을 키우고자 외국에서 지도자 연수를 받을 생각을 했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자신이 키운 선수들이 2008-2009시즌 챔피언이 되는 순간도 같이하지 못하고 TV로 지켜보면서 박수를 보내야 했다.
성적이 부진했던 다른 구단들은 해고당한 황 감독에 눈독을 들였다.
현대건설에서 감독 제의가 있었고 지난해 5월 새로 감독으로 뽑히면서 또 한 번 도전을 시작했다.
◇"프로는 1등만 기억한다"
감독으로 선정된 뒤 만난 현대건설 선수들에게는 하위팀의 무기력함이 배어 있었다.
패배의식에 빠져 자신감이 없었을 뿐 아니라 운동에 재미를 못 느꼈다.
황 감독은 훈련보다는 선수 생각을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코치나 트레이너도 뽑지 않고 혼자서 한 달 동안 선수들과 대화하며 훈련했다.
"스포츠에 2등은 없다"는 철학을 가진 황 감독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왜 배구를 하는지, 잘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면서 자신감을 불어넣었다"고 설명했다.
경기에서 당연히 이겨야 하지만 비록 지더라도 팬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립박수를 받는 플레이를 펼친다면 이길 가능성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런 생각은 경기와 연습 때만큼은 느슨함 없는 열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에게는 자연스레 독하다는 이미지가 따라붙었다.
그렇다고 황 감독이 스파르타식 훈련만을 강요하진 않는다.
"선수들이 스스로 목표 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데 더 힘을 기울인다"고 강조했다.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 아니라는 황 감독의 이력은 과거 자신의 처지에 비추어 어려운 선수나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선수와 조직력에 좀 더 관심을 두도록 했다.
그는 "흥국생명 때 김연경, 황연주, 현대건설에서는 케니가 활약을 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선수가 공격하도록 몸을 던져 수비하고 공을 올려주는 이들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하다"며 조직력을 강조한다.
황 감독은 지금 맡은 지 불과 반년 남짓밖에 안 된 현대건설을 정상에 올려놓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다.
"작년보다 선수들이 해 내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페이스로만 해준다면 성적이 잘 나올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를 자를 때 흥국생명은 ’승부에만 집착한 나머지 구단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설명해 배구팬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했다.
’우승 청부사’, ’독사’ 등 별명에서 알 수 있듯 그에게는 강하다는 이미지가 꼬리표처럼 붙어 있다.
모기업이 건설회사인 현대건설 배구단마저 그의 강한 이미지가 부담스러워 감독으로 뽑아야 할지 망설였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황 감독이 새 사령탑으로 부임한 현대건설은 1일 현재 10승1패로 여자부 선두를 달리고 있다.
2008-2009시즌 5개 팀 중 4위, 그전 해는 꼴찌였던 팀이 별다른 전력 보강 없이 1위로 껑충 뛰어오른 것이다.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현대건설여자배구단 체육관에서 황 감독을 만나 그 비결을 들었다.
◇키가 커 시작한 배구..키에 발목잡히다
경남 하동군 악양초등학교 3학년 때 또래보다 키가 크다는 이유 하나로 처음 배구공을 만졌다.
진주시로 이사해서도 배구를 계속해 동명중학교에 들어갔으나 생각만큼 성장하지 않은 키 때문에 배구를 그만둬야 하나 고민했다.
다행히 중3, 고1 때 지금 키인 179㎝까지 자랐으나 세터로도 작은 키는 결국 선수 생활 내내 그의 발목을 잡았다.
1987년 LIG 손해보험의 전신인 금성에 입단했으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2년 정도 주전으로 뛰다 최영준(현 LIG 손보 코치)에게 밀려 백업 세터로 내려갔고 국가대표 유니폼도 한 번 입어보지 못한 채 1994년 은퇴했다.
그는 당시를 떠올리며 "신영철 씨 등 쟁쟁한 세터들이 활동했던 시기였고 작은 키라는 약점을 가진 나로서는 남들보다 배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선수로 살아남기 어려웠다"며 "그렇지만 팀에서 내 역할이 있었고 만족스럽게 했다"고 회상했다.
◇"두 번째 잘렸을 땐 내 삶을 돌이켜봤다"
1995년 호남정유 여자배구단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그는 한일전산여고 감독을 거쳐 2002년 흥국생명 코치로 들어간 뒤 이듬해 10월 37세의 젊은 나이에 프로배구 감독 자리에 올랐다.
프로배구 출범 원년인 2005 V리그에서 불과 3승(13패)만을 올리며 꼴찌로 처지기도 했지만 가장 큰 시련은 2006년 2월 찾아왔다.
흥국생명은 당시 김연경과 황연주라는 막강 공격수를 앞세워 정규리그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우승에 갈증을 느끼던 구단이 갑자기 호남정유 92연승 신화를 이끈 우승청부사 김철용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들인 것이었다.
"그때 기분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날벼락 맞은 기분이라고나 할까"
충격이 컸던 황 감독은 진주로 돌아가 두 달가량 술에 빠져 살았다.
하지만 흥국생명은 그 해 12월 다시 김 감독을 해임하고 황 감독을 불러올렸다.
"흥국생명의 제안을 받고 망설였지만 함께 어려움을 나눴던 선수들과 우승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슴속에 차 있어서 수락했다"고 말했다.
2006-2007시즌 흥국생명은 통합 챔피언에 오르면서 황 감독은 우승 감독의 소원을 풀었다.
그러나 2008년 12월 흥국생명이 1위를 달리던 중 승부에 집착해 구단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또 한 번 잘렸다.
황 감독은 "구단에서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다른 사정이 있었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두 번째 해고 때는 더는 망가질 것도 없단 생각에 나 자신을 돌이켜봤고 실력을 키우고자 외국에서 지도자 연수를 받을 생각을 했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자신이 키운 선수들이 2008-2009시즌 챔피언이 되는 순간도 같이하지 못하고 TV로 지켜보면서 박수를 보내야 했다.
성적이 부진했던 다른 구단들은 해고당한 황 감독에 눈독을 들였다.
현대건설에서 감독 제의가 있었고 지난해 5월 새로 감독으로 뽑히면서 또 한 번 도전을 시작했다.
◇"프로는 1등만 기억한다"
감독으로 선정된 뒤 만난 현대건설 선수들에게는 하위팀의 무기력함이 배어 있었다.
패배의식에 빠져 자신감이 없었을 뿐 아니라 운동에 재미를 못 느꼈다.
황 감독은 훈련보다는 선수 생각을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코치나 트레이너도 뽑지 않고 혼자서 한 달 동안 선수들과 대화하며 훈련했다.
"스포츠에 2등은 없다"는 철학을 가진 황 감독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왜 배구를 하는지, 잘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면서 자신감을 불어넣었다"고 설명했다.
경기에서 당연히 이겨야 하지만 비록 지더라도 팬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립박수를 받는 플레이를 펼친다면 이길 가능성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런 생각은 경기와 연습 때만큼은 느슨함 없는 열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에게는 자연스레 독하다는 이미지가 따라붙었다.
그렇다고 황 감독이 스파르타식 훈련만을 강요하진 않는다.
"선수들이 스스로 목표 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데 더 힘을 기울인다"고 강조했다.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 아니라는 황 감독의 이력은 과거 자신의 처지에 비추어 어려운 선수나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선수와 조직력에 좀 더 관심을 두도록 했다.
그는 "흥국생명 때 김연경, 황연주, 현대건설에서는 케니가 활약을 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선수가 공격하도록 몸을 던져 수비하고 공을 올려주는 이들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하다"며 조직력을 강조한다.
황 감독은 지금 맡은 지 불과 반년 남짓밖에 안 된 현대건설을 정상에 올려놓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다.
"작년보다 선수들이 해 내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페이스로만 해준다면 성적이 잘 나올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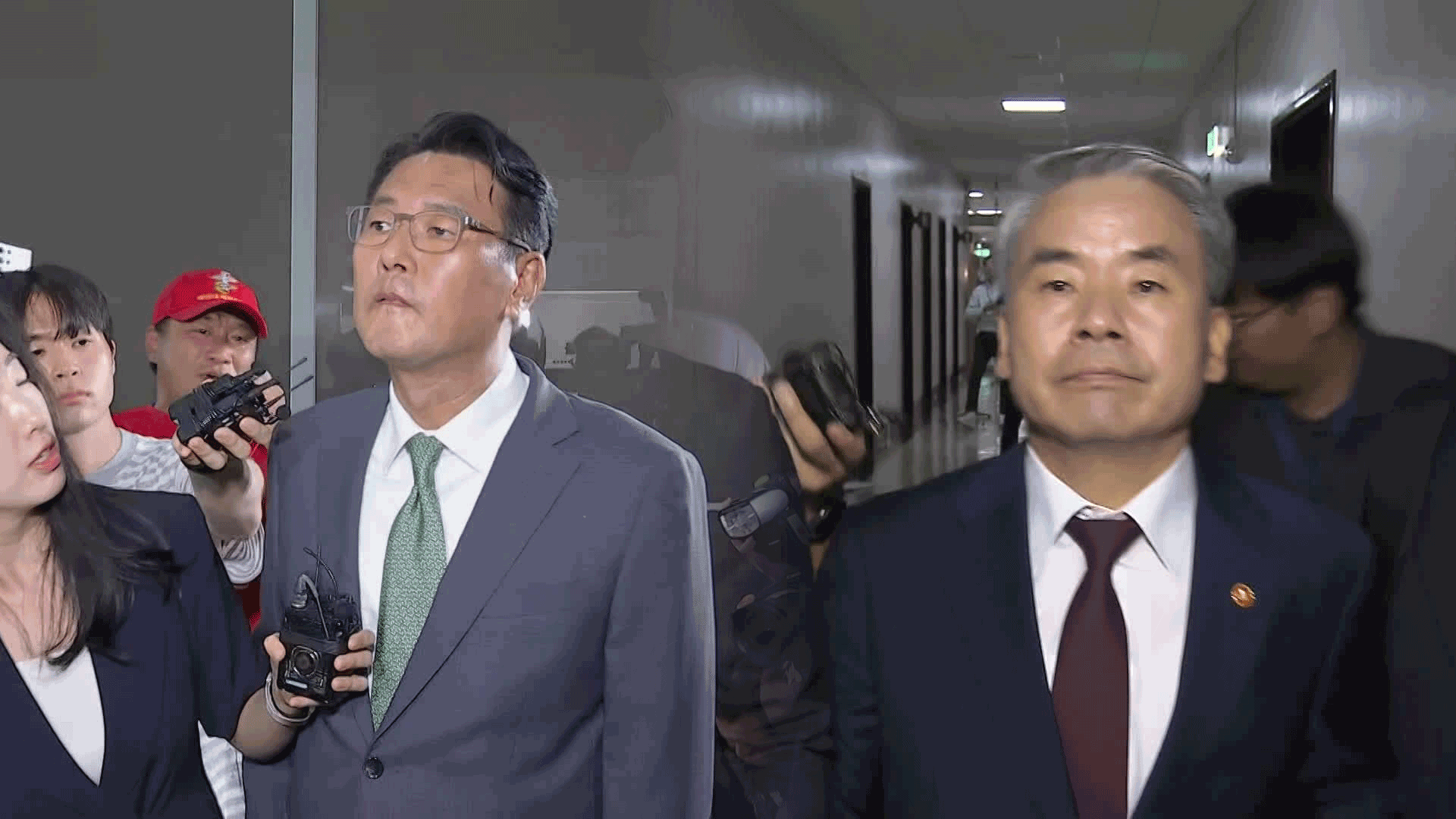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