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따라잡기] ‘화장실에서 먹는 밥’ 그들을 아세요?
입력 2010.03.08 (08:59)
수정 2010.03.08 (15: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오늘이 102번째 세계 여성의 날인데요. 여성의 날을 맞아 ‘따뜻한 밥 한끼 먹을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이민우 기자, 북한도 아니고,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라는게 언뜻 잘 와닿지 않는데요. 어떤 여성들을 말하는겁니까?
<리포트>
네, 건물의 여성 청소미화노동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점심에, 저녁에 따뜻한 밥 한끼 먹을 공간이 없어, 이들 여성 노동자들은 냄새 나는 화장실에서, 차가운 지하 계단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신경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들을 ‘존재감 없는 투명인간’으로 여기기 때문인데요. 고령에 비정규직, 그리고 여성. 이 세가지 차별이 합쳐진 사람들, 여성 청소미화노동자들의 밥 한끼의 사연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서울의 한 공원에서 아주머니들이 무언가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녹취> 미화노동자 : "나에게 밥은 생명이지 뭐."
일터에서, 생명과도 같은 밥 한 끼를 좀 더 인간적인 환경에서 먹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녹취> 미화노동자 : "계단 밑에 화장실 옆에서 먹었어요. 바퀴벌레도 말도 못하게 바글바글한 곳에서 살았어요. "
회사에서. 도시 큰 건물에서 마주치는 미화 노동자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의 밥 한끼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이들을 투명인간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일하는 멕시코 청소 용역 노동자들의 이야기인 영화 ‘빵과 장미’의 한 장면인데요, 오늘 뉴스 따라잡기는 이 유니폼을 입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이야깁니다.
아직 깜깜한 새벽, 55살 김 모씨가 이른 아침을 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 대학병원의 소아병동에서 미화노동일을 하는 김 씨는 5시 20분까지 출근해야 합니다.
<녹취> 미화노동자 : "우리 식구들 내가 편하게 일하는 줄 알아. 자꾸 관심을 갖지. 어떤 일이에요 묻는 건데. 그런 걸 잘 말 안하지. 애들이 좋아하나."
출근준비가 다 되면 서둘러 꼭 챙겨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락입니다.
<녹취> 미화노동자 : "어쩔 때는 먹고 어쩔 때는 안 먹고 이렇게 싸가지고 가면 반은 아침 반은 점심 이런 식으로 밥 한 끼 먹는 거야."
그러나 점심땐 이미 차가워진 이 도시락으로 하루를 버텨야 합니다. 도시락 먹는 것도 버겁지만, 도시락 먹는 장소는 더 힘겹습니다. 병원엔 편히 앉아 도시락을 먹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녹취> 미화노동자 : "화장실 같은데 그런데 가서. 그 자리가 병원에서 리모델링 하면서 빈공간이 있어. 그런 데에 들어가서 우리가 쉬어요."
미화 노동자들이 일명 ‘비트’라고 부르는 비밀 아지트인데요, 그러나 병원측에서 요구하면 즉시 비워줘야 합니다.
<녹취>미화노동자 : "그냥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지금 우리한테는 인권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는 거야 일만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밥 먹을 공간조차 없이 2년을 버텨왔고, 이젠 이 불평등한 환경마저 익숙하고 담담해져버렸습니다.
<녹취> 미화노동자 : "힘이 들죠. 힘 안 드는 게 어디 있어. 그래도 일을 해야 되니까 일어나서 가야지. 첫 차타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 다."
2년을 하루같이 저 큰 건물 속에서 일해왔지만, 이 씨에게 허락된 공간은 한 곳도 없습니다.
<녹취> 미화노동자 : "쉬면서 밥 한끼라도 먹을 때도 누군가가 봤을 때도 모양새가 좋은 공간이 있었으며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먹는 게 하도 누추하니까 누가 먹는 모습, 쉬는 모습을 보면 창피하거든."
대학에서 일하는 미화노동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토요일이지만 특근으로 혼자 출근해 일을 하고 있는 60세 박 모씨. 요즘 들어 일이 많아 부쩍 힘에 부친다는데요,
<녹취> 미화노동자 : "한 사람당 배당된 양이 과도하게 많아요. 겨울 내 일하면서 침맞고 다니고. 그래도 팔이 안 올라가요. 이렇게. 어깨를 과다하게 써 갖고요."
한참 일을 하고 나면 어느새 점심시간, 1평 남짓한 휴게실에서 혼자 먹습니다. 집에서 싸온 도시락은 식은 지 오래지만 일을 하기 위해 먹어야 합니다.
<녹취> 미화노동자 : "여기는 화재가 일어날 위험이 있다고 밥통도 못 쓰게 해요. 그러니 따뜻한 밥 싸가지고 와도 찬밥이 되죠. 일 대충 끝내 놓고 먹고, 그러고 또 일 시작하고요."
다시 시작되는 오후 일, 그러나 일보다 더 힘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녹취> 미화노동자 : "작업복 입고 있으면 투명인간으로 보죠 뭐. 혹시라도 몸에 스치면 기절을 하죠. 아주 큰 오물, 벌레가 닿는 것처럼."
전국의 청소 노동자는 43만 여명. 그 중 여성 청소노동자가 73%, 평균 연령은 57세입니다.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류남미(공공서비스노조) : "여성에 고령에 비정규직이라는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이 노동자들을 사회적으로 유령을 만들고 있다. 없는 사람 취급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
<인터뷰> 류남미(공공서비스노조) : "이 사진을 찍으러 갔던 분이. 5분정도도 제대로 못 앉아 있겠다고 할 정도로 악취, 화장실 냄새 때문에. 근데 미화 노동자들은 이공간에서 식사하시고 쉬시고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우선 절실한 것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더 절실한 것은 인간적인 시선, 인간적인 대우입니다.
<녹취> 미화노동자 : "우리를 인간대접 안 해주니까 그게 제일 서운해요."
<녹취> 미화노동자 : "제가 이일을 하면서 제가 많은 쓰레기를 치우고 있지만 사람까지 쓰레기 취급받는 다는 건 정말 이런데 들어와서 알게 되었거든요."
첫차를 타고 병원으로 출근했던 김 씨가 11시간의 일을 마치고 병원을 나섭니다.
<녹취> 미화노동자 : "(점심 어디서 드셨는지) 지하실에서. 변함없는 하루 일과 속에서 맛있게 먹었지. (퇴근하시니까 기분은 좋으신가 봐요?) 집에 가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앞서 보여드린 영화 ‘빵과 장미’의 여주인공은 말합니다. 우리는 빵과 함께 장미도 원한다고 말이죠.
우리 사회는 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를 아직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 청소미화노동자들, 이들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이 102번째 세계 여성의 날인데요. 여성의 날을 맞아 ‘따뜻한 밥 한끼 먹을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이민우 기자, 북한도 아니고,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라는게 언뜻 잘 와닿지 않는데요. 어떤 여성들을 말하는겁니까?
<리포트>
네, 건물의 여성 청소미화노동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점심에, 저녁에 따뜻한 밥 한끼 먹을 공간이 없어, 이들 여성 노동자들은 냄새 나는 화장실에서, 차가운 지하 계단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신경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들을 ‘존재감 없는 투명인간’으로 여기기 때문인데요. 고령에 비정규직, 그리고 여성. 이 세가지 차별이 합쳐진 사람들, 여성 청소미화노동자들의 밥 한끼의 사연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서울의 한 공원에서 아주머니들이 무언가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녹취> 미화노동자 : "나에게 밥은 생명이지 뭐."
일터에서, 생명과도 같은 밥 한 끼를 좀 더 인간적인 환경에서 먹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녹취> 미화노동자 : "계단 밑에 화장실 옆에서 먹었어요. 바퀴벌레도 말도 못하게 바글바글한 곳에서 살았어요. "
회사에서. 도시 큰 건물에서 마주치는 미화 노동자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의 밥 한끼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이들을 투명인간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일하는 멕시코 청소 용역 노동자들의 이야기인 영화 ‘빵과 장미’의 한 장면인데요, 오늘 뉴스 따라잡기는 이 유니폼을 입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이야깁니다.
아직 깜깜한 새벽, 55살 김 모씨가 이른 아침을 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 대학병원의 소아병동에서 미화노동일을 하는 김 씨는 5시 20분까지 출근해야 합니다.
<녹취> 미화노동자 : "우리 식구들 내가 편하게 일하는 줄 알아. 자꾸 관심을 갖지. 어떤 일이에요 묻는 건데. 그런 걸 잘 말 안하지. 애들이 좋아하나."
출근준비가 다 되면 서둘러 꼭 챙겨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락입니다.
<녹취> 미화노동자 : "어쩔 때는 먹고 어쩔 때는 안 먹고 이렇게 싸가지고 가면 반은 아침 반은 점심 이런 식으로 밥 한 끼 먹는 거야."
그러나 점심땐 이미 차가워진 이 도시락으로 하루를 버텨야 합니다. 도시락 먹는 것도 버겁지만, 도시락 먹는 장소는 더 힘겹습니다. 병원엔 편히 앉아 도시락을 먹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녹취> 미화노동자 : "화장실 같은데 그런데 가서. 그 자리가 병원에서 리모델링 하면서 빈공간이 있어. 그런 데에 들어가서 우리가 쉬어요."
미화 노동자들이 일명 ‘비트’라고 부르는 비밀 아지트인데요, 그러나 병원측에서 요구하면 즉시 비워줘야 합니다.
<녹취>미화노동자 : "그냥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지금 우리한테는 인권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는 거야 일만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밥 먹을 공간조차 없이 2년을 버텨왔고, 이젠 이 불평등한 환경마저 익숙하고 담담해져버렸습니다.
<녹취> 미화노동자 : "힘이 들죠. 힘 안 드는 게 어디 있어. 그래도 일을 해야 되니까 일어나서 가야지. 첫 차타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 다."
2년을 하루같이 저 큰 건물 속에서 일해왔지만, 이 씨에게 허락된 공간은 한 곳도 없습니다.
<녹취> 미화노동자 : "쉬면서 밥 한끼라도 먹을 때도 누군가가 봤을 때도 모양새가 좋은 공간이 있었으며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먹는 게 하도 누추하니까 누가 먹는 모습, 쉬는 모습을 보면 창피하거든."
대학에서 일하는 미화노동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토요일이지만 특근으로 혼자 출근해 일을 하고 있는 60세 박 모씨. 요즘 들어 일이 많아 부쩍 힘에 부친다는데요,
<녹취> 미화노동자 : "한 사람당 배당된 양이 과도하게 많아요. 겨울 내 일하면서 침맞고 다니고. 그래도 팔이 안 올라가요. 이렇게. 어깨를 과다하게 써 갖고요."
한참 일을 하고 나면 어느새 점심시간, 1평 남짓한 휴게실에서 혼자 먹습니다. 집에서 싸온 도시락은 식은 지 오래지만 일을 하기 위해 먹어야 합니다.
<녹취> 미화노동자 : "여기는 화재가 일어날 위험이 있다고 밥통도 못 쓰게 해요. 그러니 따뜻한 밥 싸가지고 와도 찬밥이 되죠. 일 대충 끝내 놓고 먹고, 그러고 또 일 시작하고요."
다시 시작되는 오후 일, 그러나 일보다 더 힘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녹취> 미화노동자 : "작업복 입고 있으면 투명인간으로 보죠 뭐. 혹시라도 몸에 스치면 기절을 하죠. 아주 큰 오물, 벌레가 닿는 것처럼."
전국의 청소 노동자는 43만 여명. 그 중 여성 청소노동자가 73%, 평균 연령은 57세입니다.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류남미(공공서비스노조) : "여성에 고령에 비정규직이라는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이 노동자들을 사회적으로 유령을 만들고 있다. 없는 사람 취급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
<인터뷰> 류남미(공공서비스노조) : "이 사진을 찍으러 갔던 분이. 5분정도도 제대로 못 앉아 있겠다고 할 정도로 악취, 화장실 냄새 때문에. 근데 미화 노동자들은 이공간에서 식사하시고 쉬시고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우선 절실한 것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더 절실한 것은 인간적인 시선, 인간적인 대우입니다.
<녹취> 미화노동자 : "우리를 인간대접 안 해주니까 그게 제일 서운해요."
<녹취> 미화노동자 : "제가 이일을 하면서 제가 많은 쓰레기를 치우고 있지만 사람까지 쓰레기 취급받는 다는 건 정말 이런데 들어와서 알게 되었거든요."
첫차를 타고 병원으로 출근했던 김 씨가 11시간의 일을 마치고 병원을 나섭니다.
<녹취> 미화노동자 : "(점심 어디서 드셨는지) 지하실에서. 변함없는 하루 일과 속에서 맛있게 먹었지. (퇴근하시니까 기분은 좋으신가 봐요?) 집에 가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앞서 보여드린 영화 ‘빵과 장미’의 여주인공은 말합니다. 우리는 빵과 함께 장미도 원한다고 말이죠.
우리 사회는 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를 아직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 청소미화노동자들, 이들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뉴스따라잡기] ‘화장실에서 먹는 밥’ 그들을 아세요?
-
- 입력 2010-03-08 08:59:10
- 수정2010-03-08 15:02:30

<앵커 멘트>
오늘이 102번째 세계 여성의 날인데요. 여성의 날을 맞아 ‘따뜻한 밥 한끼 먹을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이민우 기자, 북한도 아니고,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라는게 언뜻 잘 와닿지 않는데요. 어떤 여성들을 말하는겁니까?
<리포트>
네, 건물의 여성 청소미화노동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점심에, 저녁에 따뜻한 밥 한끼 먹을 공간이 없어, 이들 여성 노동자들은 냄새 나는 화장실에서, 차가운 지하 계단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신경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들을 ‘존재감 없는 투명인간’으로 여기기 때문인데요. 고령에 비정규직, 그리고 여성. 이 세가지 차별이 합쳐진 사람들, 여성 청소미화노동자들의 밥 한끼의 사연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서울의 한 공원에서 아주머니들이 무언가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녹취> 미화노동자 : "나에게 밥은 생명이지 뭐."
일터에서, 생명과도 같은 밥 한 끼를 좀 더 인간적인 환경에서 먹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녹취> 미화노동자 : "계단 밑에 화장실 옆에서 먹었어요. 바퀴벌레도 말도 못하게 바글바글한 곳에서 살았어요. "
회사에서. 도시 큰 건물에서 마주치는 미화 노동자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의 밥 한끼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이들을 투명인간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일하는 멕시코 청소 용역 노동자들의 이야기인 영화 ‘빵과 장미’의 한 장면인데요, 오늘 뉴스 따라잡기는 이 유니폼을 입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이야깁니다.
아직 깜깜한 새벽, 55살 김 모씨가 이른 아침을 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 대학병원의 소아병동에서 미화노동일을 하는 김 씨는 5시 20분까지 출근해야 합니다.
<녹취> 미화노동자 : "우리 식구들 내가 편하게 일하는 줄 알아. 자꾸 관심을 갖지. 어떤 일이에요 묻는 건데. 그런 걸 잘 말 안하지. 애들이 좋아하나."
출근준비가 다 되면 서둘러 꼭 챙겨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락입니다.
<녹취> 미화노동자 : "어쩔 때는 먹고 어쩔 때는 안 먹고 이렇게 싸가지고 가면 반은 아침 반은 점심 이런 식으로 밥 한 끼 먹는 거야."
그러나 점심땐 이미 차가워진 이 도시락으로 하루를 버텨야 합니다. 도시락 먹는 것도 버겁지만, 도시락 먹는 장소는 더 힘겹습니다. 병원엔 편히 앉아 도시락을 먹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녹취> 미화노동자 : "화장실 같은데 그런데 가서. 그 자리가 병원에서 리모델링 하면서 빈공간이 있어. 그런 데에 들어가서 우리가 쉬어요."
미화 노동자들이 일명 ‘비트’라고 부르는 비밀 아지트인데요, 그러나 병원측에서 요구하면 즉시 비워줘야 합니다.
<녹취>미화노동자 : "그냥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지금 우리한테는 인권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는 거야 일만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밥 먹을 공간조차 없이 2년을 버텨왔고, 이젠 이 불평등한 환경마저 익숙하고 담담해져버렸습니다.
<녹취> 미화노동자 : "힘이 들죠. 힘 안 드는 게 어디 있어. 그래도 일을 해야 되니까 일어나서 가야지. 첫 차타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 다."
2년을 하루같이 저 큰 건물 속에서 일해왔지만, 이 씨에게 허락된 공간은 한 곳도 없습니다.
<녹취> 미화노동자 : "쉬면서 밥 한끼라도 먹을 때도 누군가가 봤을 때도 모양새가 좋은 공간이 있었으며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먹는 게 하도 누추하니까 누가 먹는 모습, 쉬는 모습을 보면 창피하거든."
대학에서 일하는 미화노동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토요일이지만 특근으로 혼자 출근해 일을 하고 있는 60세 박 모씨. 요즘 들어 일이 많아 부쩍 힘에 부친다는데요,
<녹취> 미화노동자 : "한 사람당 배당된 양이 과도하게 많아요. 겨울 내 일하면서 침맞고 다니고. 그래도 팔이 안 올라가요. 이렇게. 어깨를 과다하게 써 갖고요."
한참 일을 하고 나면 어느새 점심시간, 1평 남짓한 휴게실에서 혼자 먹습니다. 집에서 싸온 도시락은 식은 지 오래지만 일을 하기 위해 먹어야 합니다.
<녹취> 미화노동자 : "여기는 화재가 일어날 위험이 있다고 밥통도 못 쓰게 해요. 그러니 따뜻한 밥 싸가지고 와도 찬밥이 되죠. 일 대충 끝내 놓고 먹고, 그러고 또 일 시작하고요."
다시 시작되는 오후 일, 그러나 일보다 더 힘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녹취> 미화노동자 : "작업복 입고 있으면 투명인간으로 보죠 뭐. 혹시라도 몸에 스치면 기절을 하죠. 아주 큰 오물, 벌레가 닿는 것처럼."
전국의 청소 노동자는 43만 여명. 그 중 여성 청소노동자가 73%, 평균 연령은 57세입니다.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류남미(공공서비스노조) : "여성에 고령에 비정규직이라는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이 노동자들을 사회적으로 유령을 만들고 있다. 없는 사람 취급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
<인터뷰> 류남미(공공서비스노조) : "이 사진을 찍으러 갔던 분이. 5분정도도 제대로 못 앉아 있겠다고 할 정도로 악취, 화장실 냄새 때문에. 근데 미화 노동자들은 이공간에서 식사하시고 쉬시고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우선 절실한 것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더 절실한 것은 인간적인 시선, 인간적인 대우입니다.
<녹취> 미화노동자 : "우리를 인간대접 안 해주니까 그게 제일 서운해요."
<녹취> 미화노동자 : "제가 이일을 하면서 제가 많은 쓰레기를 치우고 있지만 사람까지 쓰레기 취급받는 다는 건 정말 이런데 들어와서 알게 되었거든요."
첫차를 타고 병원으로 출근했던 김 씨가 11시간의 일을 마치고 병원을 나섭니다.
<녹취> 미화노동자 : "(점심 어디서 드셨는지) 지하실에서. 변함없는 하루 일과 속에서 맛있게 먹었지. (퇴근하시니까 기분은 좋으신가 봐요?) 집에 가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앞서 보여드린 영화 ‘빵과 장미’의 여주인공은 말합니다. 우리는 빵과 함께 장미도 원한다고 말이죠.
우리 사회는 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를 아직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 청소미화노동자들, 이들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이 102번째 세계 여성의 날인데요. 여성의 날을 맞아 ‘따뜻한 밥 한끼 먹을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이민우 기자, 북한도 아니고,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라는게 언뜻 잘 와닿지 않는데요. 어떤 여성들을 말하는겁니까?
<리포트>
네, 건물의 여성 청소미화노동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점심에, 저녁에 따뜻한 밥 한끼 먹을 공간이 없어, 이들 여성 노동자들은 냄새 나는 화장실에서, 차가운 지하 계단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신경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들을 ‘존재감 없는 투명인간’으로 여기기 때문인데요. 고령에 비정규직, 그리고 여성. 이 세가지 차별이 합쳐진 사람들, 여성 청소미화노동자들의 밥 한끼의 사연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서울의 한 공원에서 아주머니들이 무언가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녹취> 미화노동자 : "나에게 밥은 생명이지 뭐."
일터에서, 생명과도 같은 밥 한 끼를 좀 더 인간적인 환경에서 먹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녹취> 미화노동자 : "계단 밑에 화장실 옆에서 먹었어요. 바퀴벌레도 말도 못하게 바글바글한 곳에서 살았어요. "
회사에서. 도시 큰 건물에서 마주치는 미화 노동자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의 밥 한끼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이들을 투명인간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일하는 멕시코 청소 용역 노동자들의 이야기인 영화 ‘빵과 장미’의 한 장면인데요, 오늘 뉴스 따라잡기는 이 유니폼을 입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이야깁니다.
아직 깜깜한 새벽, 55살 김 모씨가 이른 아침을 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 대학병원의 소아병동에서 미화노동일을 하는 김 씨는 5시 20분까지 출근해야 합니다.
<녹취> 미화노동자 : "우리 식구들 내가 편하게 일하는 줄 알아. 자꾸 관심을 갖지. 어떤 일이에요 묻는 건데. 그런 걸 잘 말 안하지. 애들이 좋아하나."
출근준비가 다 되면 서둘러 꼭 챙겨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락입니다.
<녹취> 미화노동자 : "어쩔 때는 먹고 어쩔 때는 안 먹고 이렇게 싸가지고 가면 반은 아침 반은 점심 이런 식으로 밥 한 끼 먹는 거야."
그러나 점심땐 이미 차가워진 이 도시락으로 하루를 버텨야 합니다. 도시락 먹는 것도 버겁지만, 도시락 먹는 장소는 더 힘겹습니다. 병원엔 편히 앉아 도시락을 먹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녹취> 미화노동자 : "화장실 같은데 그런데 가서. 그 자리가 병원에서 리모델링 하면서 빈공간이 있어. 그런 데에 들어가서 우리가 쉬어요."
미화 노동자들이 일명 ‘비트’라고 부르는 비밀 아지트인데요, 그러나 병원측에서 요구하면 즉시 비워줘야 합니다.
<녹취>미화노동자 : "그냥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지금 우리한테는 인권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는 거야 일만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밥 먹을 공간조차 없이 2년을 버텨왔고, 이젠 이 불평등한 환경마저 익숙하고 담담해져버렸습니다.
<녹취> 미화노동자 : "힘이 들죠. 힘 안 드는 게 어디 있어. 그래도 일을 해야 되니까 일어나서 가야지. 첫 차타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 다."
2년을 하루같이 저 큰 건물 속에서 일해왔지만, 이 씨에게 허락된 공간은 한 곳도 없습니다.
<녹취> 미화노동자 : "쉬면서 밥 한끼라도 먹을 때도 누군가가 봤을 때도 모양새가 좋은 공간이 있었으며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먹는 게 하도 누추하니까 누가 먹는 모습, 쉬는 모습을 보면 창피하거든."
대학에서 일하는 미화노동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토요일이지만 특근으로 혼자 출근해 일을 하고 있는 60세 박 모씨. 요즘 들어 일이 많아 부쩍 힘에 부친다는데요,
<녹취> 미화노동자 : "한 사람당 배당된 양이 과도하게 많아요. 겨울 내 일하면서 침맞고 다니고. 그래도 팔이 안 올라가요. 이렇게. 어깨를 과다하게 써 갖고요."
한참 일을 하고 나면 어느새 점심시간, 1평 남짓한 휴게실에서 혼자 먹습니다. 집에서 싸온 도시락은 식은 지 오래지만 일을 하기 위해 먹어야 합니다.
<녹취> 미화노동자 : "여기는 화재가 일어날 위험이 있다고 밥통도 못 쓰게 해요. 그러니 따뜻한 밥 싸가지고 와도 찬밥이 되죠. 일 대충 끝내 놓고 먹고, 그러고 또 일 시작하고요."
다시 시작되는 오후 일, 그러나 일보다 더 힘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녹취> 미화노동자 : "작업복 입고 있으면 투명인간으로 보죠 뭐. 혹시라도 몸에 스치면 기절을 하죠. 아주 큰 오물, 벌레가 닿는 것처럼."
전국의 청소 노동자는 43만 여명. 그 중 여성 청소노동자가 73%, 평균 연령은 57세입니다.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류남미(공공서비스노조) : "여성에 고령에 비정규직이라는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이 노동자들을 사회적으로 유령을 만들고 있다. 없는 사람 취급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
<인터뷰> 류남미(공공서비스노조) : "이 사진을 찍으러 갔던 분이. 5분정도도 제대로 못 앉아 있겠다고 할 정도로 악취, 화장실 냄새 때문에. 근데 미화 노동자들은 이공간에서 식사하시고 쉬시고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우선 절실한 것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더 절실한 것은 인간적인 시선, 인간적인 대우입니다.
<녹취> 미화노동자 : "우리를 인간대접 안 해주니까 그게 제일 서운해요."
<녹취> 미화노동자 : "제가 이일을 하면서 제가 많은 쓰레기를 치우고 있지만 사람까지 쓰레기 취급받는 다는 건 정말 이런데 들어와서 알게 되었거든요."
첫차를 타고 병원으로 출근했던 김 씨가 11시간의 일을 마치고 병원을 나섭니다.
<녹취> 미화노동자 : "(점심 어디서 드셨는지) 지하실에서. 변함없는 하루 일과 속에서 맛있게 먹었지. (퇴근하시니까 기분은 좋으신가 봐요?) 집에 가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앞서 보여드린 영화 ‘빵과 장미’의 여주인공은 말합니다. 우리는 빵과 함께 장미도 원한다고 말이죠.
우리 사회는 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를 아직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 청소미화노동자들, 이들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
-

이민우 기자 kbsminoo@gmail.com
이민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연예수첩] ‘반가운 얼굴’ 연예 사병 한자리에](https://news.kbs.co.kr/data/news/2010/03/08/2059419_AcV.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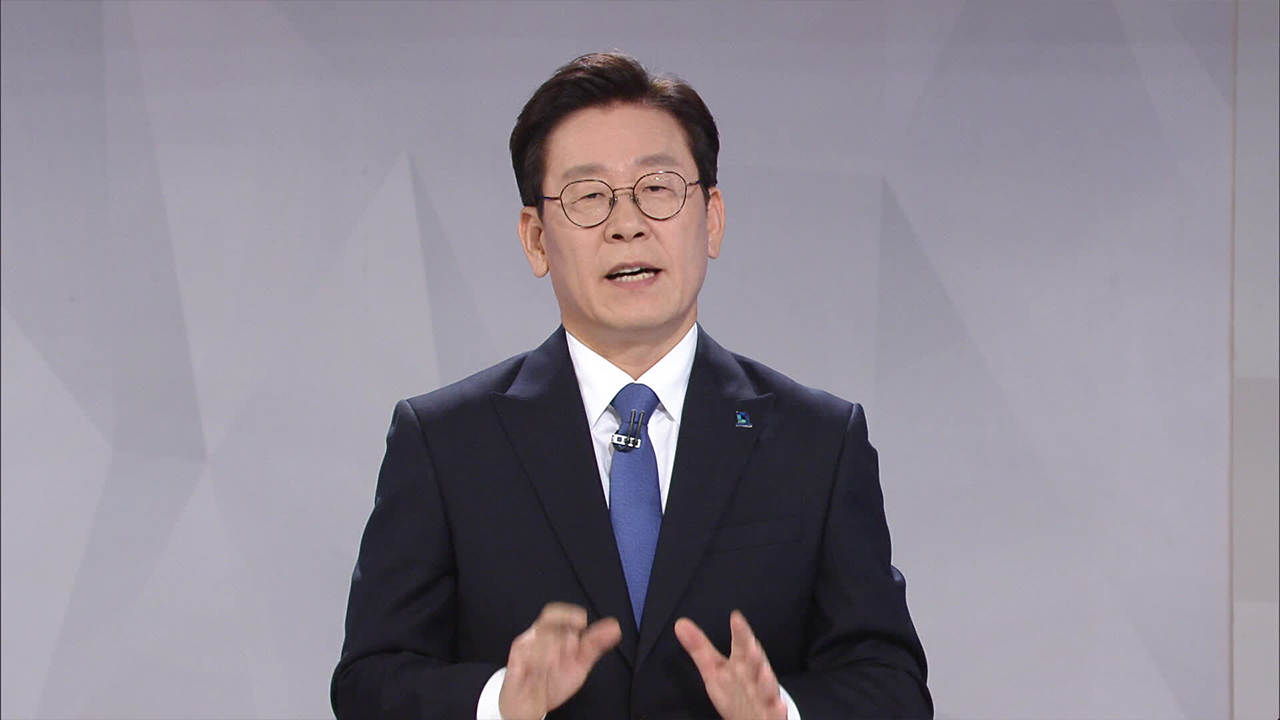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