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구조조정 시즌을 앞두고 `불의의 일격'을 당한 금융감독당국과 은행들이 전열을 정비하고 반격에 나섰다.
우선 은행들은 당국의 주도 아래 대기업에 대한 `무조건 우대'가 더 이상 없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기업 부실 계열사의 신용위험평가에서 모기업이 뼈를 깎는 지원책을 내놓지 않는 한 `온정'을 두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효성그룹과 LIG그룹 등의 부실 계열사 `꼬리 자르기'에 뒤통수를 맞은 만큼 모기업의 확고하고 검증된 지원 계획이 없다면 채권자로서 냉혹한 칼을 휘두를 수밖에 없다는 것.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3일 "채권금융기관과 협의조차 않고 기습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LIG건설의 사례는 구조조정에 임하는 대기업으로서 부도덕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이 부분은 반드시 손을 보겠다"고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는 기업 신용위험평가에서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가점 부여를 엄격히 하겠다"며 "예전에는 모기업이 계열사를 지원하겠다는 `각서' 정도만 있으면 평가에 가점을 줬으나, 앞으로는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령 모기업의 증자가 필요한 경우, 과거에는 단순히 증자를 하겠다는 구두 약속이나 간단한 서면 제출만으로 C등급(워크아웃) 대상 계열사가 가점을 받아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매겨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증자의 시기, 규모, 자금조달 방법, 실현 가능성 등을 일일이 따지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LIG 사례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흐릴 수 있는지 보여준 것"이라며 "시장의 신뢰와 관례가 무너져 다른 선량한 대기업들도 피해를 보거나 불편을 겪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은행들은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주채무 계열 기업의 경우 계열사 후광효과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기업의 자체 재무안정성과 사업 포트폴리오 등 개별 기업의 신용도를 중심으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신용위험평가 때 대기업 계열사에 가점을 주는 게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무조건 가점을 주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중은행의 기업 신용평가 담당자도 "은행들이 그동안 대기업이라면 좀 봐주는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인식이 사라졌다"며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말처럼 이제껏 이어져 온 낙관적인 생각을 걷어냈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들이 과연 혹독한 구조조정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기업 신용평가 부서에서 C등급과 D등급을 추려내도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마케팅이나 영업 담당 부서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고,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많아질수록 은행의 충당금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한 고위 인사는 "은행으로서는 그냥 두면 대출금의 0.5%만 충당금으로 쌓아도 되는데 굳이 대출금의 20%를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할 유인이 적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은행들이 이기심에 막상 구조조정이 닥치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며 "당국이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금융위기 이후 상당 폭 구조조정이 이뤄진 데다 지난해 경기가 2009년보다 나아져 실제로 구조조정 심판대에 오를 기업은 지난해보다 다소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C등급 38개, D등급 27개 등 65개의 기업을 추려냈다면 2010년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올해는 이보다 적은 기업이 C~D등급으로 분류될 것이라는 게 당국과 은행권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기업 구조조정 분야의 한 전문가는 "중견 조선업체와 해운업체는 부실이 나올 곳은 거의 다 나온 것 같다"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경기가 대부분 호전돼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많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가장 문제가 큰 건설업의 경우 현재로서는 5개 안팎의 건설사가 시장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시장에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시공능력 기준 100대 건설사 가운데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거쳐 27개 건설사가 걸러졌고 상위 20여개 건설사는 튼튼하다고 여겨지는 가운데 일부 주택건설에 주력한 비 대기업 계열 업체들이 위험하다는 것.
우리은행 관계자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작년처럼 깐깐하게 봐야 한다. 2007년부터 사그라지기 시작한 건설경기가 몇 년째 죽어 있어서 건설사들이 여전히 어렵다. 올해도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견 건설사 위주로 부실이 이어지지 않겠나 싶다"며 "주택시장이 현실적으로 회복이 어렵고, 저축은행이 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진흥기업과 LIG건설의 뒤를 이어 대기업 계열 가운데 3~4개 건설사의 이름도 나돌고 있으나, 모기업의 지원 의사가 비교적 확고한 것으로 알려진 데다 해외 사업 포트폴리오도 꽤 있어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우선 은행들은 당국의 주도 아래 대기업에 대한 `무조건 우대'가 더 이상 없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기업 부실 계열사의 신용위험평가에서 모기업이 뼈를 깎는 지원책을 내놓지 않는 한 `온정'을 두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효성그룹과 LIG그룹 등의 부실 계열사 `꼬리 자르기'에 뒤통수를 맞은 만큼 모기업의 확고하고 검증된 지원 계획이 없다면 채권자로서 냉혹한 칼을 휘두를 수밖에 없다는 것.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3일 "채권금융기관과 협의조차 않고 기습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LIG건설의 사례는 구조조정에 임하는 대기업으로서 부도덕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이 부분은 반드시 손을 보겠다"고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는 기업 신용위험평가에서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가점 부여를 엄격히 하겠다"며 "예전에는 모기업이 계열사를 지원하겠다는 `각서' 정도만 있으면 평가에 가점을 줬으나, 앞으로는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령 모기업의 증자가 필요한 경우, 과거에는 단순히 증자를 하겠다는 구두 약속이나 간단한 서면 제출만으로 C등급(워크아웃) 대상 계열사가 가점을 받아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매겨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증자의 시기, 규모, 자금조달 방법, 실현 가능성 등을 일일이 따지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LIG 사례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흐릴 수 있는지 보여준 것"이라며 "시장의 신뢰와 관례가 무너져 다른 선량한 대기업들도 피해를 보거나 불편을 겪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은행들은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주채무 계열 기업의 경우 계열사 후광효과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기업의 자체 재무안정성과 사업 포트폴리오 등 개별 기업의 신용도를 중심으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신용위험평가 때 대기업 계열사에 가점을 주는 게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무조건 가점을 주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중은행의 기업 신용평가 담당자도 "은행들이 그동안 대기업이라면 좀 봐주는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인식이 사라졌다"며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말처럼 이제껏 이어져 온 낙관적인 생각을 걷어냈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들이 과연 혹독한 구조조정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기업 신용평가 부서에서 C등급과 D등급을 추려내도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마케팅이나 영업 담당 부서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고,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많아질수록 은행의 충당금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한 고위 인사는 "은행으로서는 그냥 두면 대출금의 0.5%만 충당금으로 쌓아도 되는데 굳이 대출금의 20%를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할 유인이 적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은행들이 이기심에 막상 구조조정이 닥치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며 "당국이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금융위기 이후 상당 폭 구조조정이 이뤄진 데다 지난해 경기가 2009년보다 나아져 실제로 구조조정 심판대에 오를 기업은 지난해보다 다소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C등급 38개, D등급 27개 등 65개의 기업을 추려냈다면 2010년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올해는 이보다 적은 기업이 C~D등급으로 분류될 것이라는 게 당국과 은행권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기업 구조조정 분야의 한 전문가는 "중견 조선업체와 해운업체는 부실이 나올 곳은 거의 다 나온 것 같다"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경기가 대부분 호전돼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많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가장 문제가 큰 건설업의 경우 현재로서는 5개 안팎의 건설사가 시장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시장에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시공능력 기준 100대 건설사 가운데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거쳐 27개 건설사가 걸러졌고 상위 20여개 건설사는 튼튼하다고 여겨지는 가운데 일부 주택건설에 주력한 비 대기업 계열 업체들이 위험하다는 것.
우리은행 관계자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작년처럼 깐깐하게 봐야 한다. 2007년부터 사그라지기 시작한 건설경기가 몇 년째 죽어 있어서 건설사들이 여전히 어렵다. 올해도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견 건설사 위주로 부실이 이어지지 않겠나 싶다"며 "주택시장이 현실적으로 회복이 어렵고, 저축은행이 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진흥기업과 LIG건설의 뒤를 이어 대기업 계열 가운데 3~4개 건설사의 이름도 나돌고 있으나, 모기업의 지원 의사가 비교적 확고한 것으로 알려진 데다 해외 사업 포트폴리오도 꽤 있어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은행들, 대기업 구조조정 칼날 세웠다
-
- 입력 2011-04-03 08:09:30
4월 구조조정 시즌을 앞두고 `불의의 일격'을 당한 금융감독당국과 은행들이 전열을 정비하고 반격에 나섰다.
우선 은행들은 당국의 주도 아래 대기업에 대한 `무조건 우대'가 더 이상 없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기업 부실 계열사의 신용위험평가에서 모기업이 뼈를 깎는 지원책을 내놓지 않는 한 `온정'을 두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효성그룹과 LIG그룹 등의 부실 계열사 `꼬리 자르기'에 뒤통수를 맞은 만큼 모기업의 확고하고 검증된 지원 계획이 없다면 채권자로서 냉혹한 칼을 휘두를 수밖에 없다는 것.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3일 "채권금융기관과 협의조차 않고 기습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LIG건설의 사례는 구조조정에 임하는 대기업으로서 부도덕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이 부분은 반드시 손을 보겠다"고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는 기업 신용위험평가에서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가점 부여를 엄격히 하겠다"며 "예전에는 모기업이 계열사를 지원하겠다는 `각서' 정도만 있으면 평가에 가점을 줬으나, 앞으로는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령 모기업의 증자가 필요한 경우, 과거에는 단순히 증자를 하겠다는 구두 약속이나 간단한 서면 제출만으로 C등급(워크아웃) 대상 계열사가 가점을 받아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매겨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증자의 시기, 규모, 자금조달 방법, 실현 가능성 등을 일일이 따지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LIG 사례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흐릴 수 있는지 보여준 것"이라며 "시장의 신뢰와 관례가 무너져 다른 선량한 대기업들도 피해를 보거나 불편을 겪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은행들은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주채무 계열 기업의 경우 계열사 후광효과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기업의 자체 재무안정성과 사업 포트폴리오 등 개별 기업의 신용도를 중심으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신용위험평가 때 대기업 계열사에 가점을 주는 게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무조건 가점을 주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중은행의 기업 신용평가 담당자도 "은행들이 그동안 대기업이라면 좀 봐주는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인식이 사라졌다"며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말처럼 이제껏 이어져 온 낙관적인 생각을 걷어냈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들이 과연 혹독한 구조조정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기업 신용평가 부서에서 C등급과 D등급을 추려내도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마케팅이나 영업 담당 부서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고,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많아질수록 은행의 충당금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한 고위 인사는 "은행으로서는 그냥 두면 대출금의 0.5%만 충당금으로 쌓아도 되는데 굳이 대출금의 20%를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할 유인이 적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은행들이 이기심에 막상 구조조정이 닥치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며 "당국이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금융위기 이후 상당 폭 구조조정이 이뤄진 데다 지난해 경기가 2009년보다 나아져 실제로 구조조정 심판대에 오를 기업은 지난해보다 다소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C등급 38개, D등급 27개 등 65개의 기업을 추려냈다면 2010년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올해는 이보다 적은 기업이 C~D등급으로 분류될 것이라는 게 당국과 은행권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기업 구조조정 분야의 한 전문가는 "중견 조선업체와 해운업체는 부실이 나올 곳은 거의 다 나온 것 같다"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경기가 대부분 호전돼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많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가장 문제가 큰 건설업의 경우 현재로서는 5개 안팎의 건설사가 시장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시장에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시공능력 기준 100대 건설사 가운데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거쳐 27개 건설사가 걸러졌고 상위 20여개 건설사는 튼튼하다고 여겨지는 가운데 일부 주택건설에 주력한 비 대기업 계열 업체들이 위험하다는 것.
우리은행 관계자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작년처럼 깐깐하게 봐야 한다. 2007년부터 사그라지기 시작한 건설경기가 몇 년째 죽어 있어서 건설사들이 여전히 어렵다. 올해도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견 건설사 위주로 부실이 이어지지 않겠나 싶다"며 "주택시장이 현실적으로 회복이 어렵고, 저축은행이 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진흥기업과 LIG건설의 뒤를 이어 대기업 계열 가운데 3~4개 건설사의 이름도 나돌고 있으나, 모기업의 지원 의사가 비교적 확고한 것으로 알려진 데다 해외 사업 포트폴리오도 꽤 있어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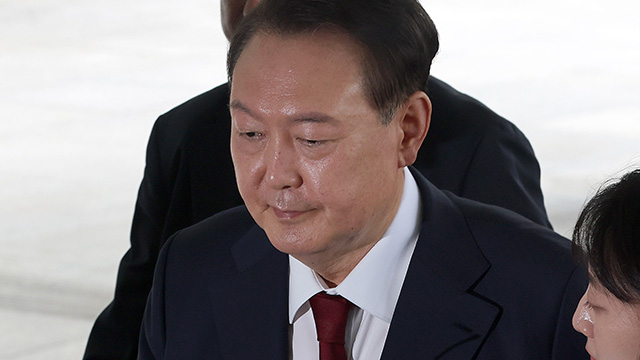

![[영상] 정성호 “검찰 해체 표현 적절치 않아…수사·기소 분리 국민 공감대”](/data/fckeditor/vod/2025/07/01/305901751367182615.png)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