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요즘 건설업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제부 박찬형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질문> 이름이 낯익은 기업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어요. 어디 어딥니까?
<답변>
조금 전에 동양건설산업이 법정관리 신청.
이로써 지난해 12월부터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는 모두 7곳으로 늘어.
한달에 한 곳 이상인데요. 지난해 12월 동일토건이 워크아웃, 한솔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
2월엔 월드건설이 워크아웃중에 법정관리를 신청.
효성 계열사인 진흥기업도 워크아웃도 법정관리 신청.
지난달엔 대기업 계열사인 LIG 건설이, 그리고 사흘전엔 국내 건설 면허 1호인 삼부토건이 각각 법정관리 신청.
오늘 동양건설산업.
전체적으론 100대 건설사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28개 건설사가 현재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중.
<질문> 건설사들이 이렇게 갑자기 부실해진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답변>
바로 PF 대출 때문.
갑자기 부실해졌다기 보다 스스로 부실을 키워온 면이 크다.
먼저 따져볼게 시행사,시공사 스스로 사업성 분석 제대로 해왔느냐.
그것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활황에 기대서 건설사 스스로 사업확대에 열을 올린 게 큰 문제.
2000년대 중반, 부동산 활황기였다.
이때 건설사들 너도나도 수익성 높은 PF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느껴졌을 것.
여기에 대출기관도 문제가 많다.
PF 대출은 건설 시행사가 특별한 담보 없이 사업성만 갖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사업을 하는 것.
대부분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시행사가 자본력이 없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 보증을 건설사들에게 요구했다.
금융기관도 사업성 분석 제대로 안하고 건설사 보증 믿고 대출해줬다는것.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푹 꺼지니까 PF사업 분양이 안 되는 것.
이러하보니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돼 보증을 선 건설사들까지 위험해진 것.
<질문> 그렇다면 건설사들이 금융권에서 이렇게 빌린 PF 대출이 얼마나 됩니까?
<답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무려 66조 원.
이 가운데 10대 건설사의 PF 대출만 22조 원.
금리가 오르면서 1년 이자만 1조 원을 넘는다.
앞으로 이런 자금압박은 더 심해질 전망.
건설사가 일을 해야 돈을 갚을텐데 현재 건설경기 불황으로 쉽지 않은 상황.
앞으로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의 말 들어보자.
<인터뷰> 김현아(건설산업연구원) :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원활하지 않을때는 시공사의 부실은 물론 시공사와 차주관계에 있는 금융기관에 부실까지 확산될수 있는 연계고리를 갖고 있어서..."
<질문> 지금 김 연구위원 말처럼 금융기관 부실까지도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 또 문제인것 같습니다. 금융기관은 어떻습니까?
<답변>
금융기관도 알다시피 부실해지고 있다.
바로 저축은행들이다.
전체 금융기관의 PF 대출 연체율은 2년전 6% 정도였다가, 지난해 말에는 13%까지 급등.
문제는 저축은행이라고 했지, 저축은행은 전체 대출금 가운데 PF 대출비중을 크게 늘렸기 때문에 타격이 크다.
브릿지론이라고 해서 시중은행의 PF대출을 받기 전까지 짧은기간동안 먼저 저축은행이 대출을 해주는건데 시중은행이 대출해준다니까 나름대로 사업성 있다고 보고 대출해준거다.
그런데, 시중은행은 전체 대출금 가운데 PF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
저축은행은 그렇지 않다.
저축은행의 PF 대출잔액은 12조 2천억원.
1년전 11%였던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25%까지 두 배 이상 급등.
지난 2월 저축은행들이 무더기로 영업정지 당하지 않았나.
다 PF 대출 부실 때문이었다.
앞으로도 대출금 회수가 제대로 안되는 저축은행들은 얼마든지 추가로 문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얘기다.
요즘 건설업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제부 박찬형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질문> 이름이 낯익은 기업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어요. 어디 어딥니까?
<답변>
조금 전에 동양건설산업이 법정관리 신청.
이로써 지난해 12월부터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는 모두 7곳으로 늘어.
한달에 한 곳 이상인데요. 지난해 12월 동일토건이 워크아웃, 한솔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
2월엔 월드건설이 워크아웃중에 법정관리를 신청.
효성 계열사인 진흥기업도 워크아웃도 법정관리 신청.
지난달엔 대기업 계열사인 LIG 건설이, 그리고 사흘전엔 국내 건설 면허 1호인 삼부토건이 각각 법정관리 신청.
오늘 동양건설산업.
전체적으론 100대 건설사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28개 건설사가 현재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중.
<질문> 건설사들이 이렇게 갑자기 부실해진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답변>
바로 PF 대출 때문.
갑자기 부실해졌다기 보다 스스로 부실을 키워온 면이 크다.
먼저 따져볼게 시행사,시공사 스스로 사업성 분석 제대로 해왔느냐.
그것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활황에 기대서 건설사 스스로 사업확대에 열을 올린 게 큰 문제.
2000년대 중반, 부동산 활황기였다.
이때 건설사들 너도나도 수익성 높은 PF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느껴졌을 것.
여기에 대출기관도 문제가 많다.
PF 대출은 건설 시행사가 특별한 담보 없이 사업성만 갖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사업을 하는 것.
대부분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시행사가 자본력이 없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 보증을 건설사들에게 요구했다.
금융기관도 사업성 분석 제대로 안하고 건설사 보증 믿고 대출해줬다는것.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푹 꺼지니까 PF사업 분양이 안 되는 것.
이러하보니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돼 보증을 선 건설사들까지 위험해진 것.
<질문> 그렇다면 건설사들이 금융권에서 이렇게 빌린 PF 대출이 얼마나 됩니까?
<답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무려 66조 원.
이 가운데 10대 건설사의 PF 대출만 22조 원.
금리가 오르면서 1년 이자만 1조 원을 넘는다.
앞으로 이런 자금압박은 더 심해질 전망.
건설사가 일을 해야 돈을 갚을텐데 현재 건설경기 불황으로 쉽지 않은 상황.
앞으로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의 말 들어보자.
<인터뷰> 김현아(건설산업연구원) :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원활하지 않을때는 시공사의 부실은 물론 시공사와 차주관계에 있는 금융기관에 부실까지 확산될수 있는 연계고리를 갖고 있어서..."
<질문> 지금 김 연구위원 말처럼 금융기관 부실까지도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 또 문제인것 같습니다. 금융기관은 어떻습니까?
<답변>
금융기관도 알다시피 부실해지고 있다.
바로 저축은행들이다.
전체 금융기관의 PF 대출 연체율은 2년전 6% 정도였다가, 지난해 말에는 13%까지 급등.
문제는 저축은행이라고 했지, 저축은행은 전체 대출금 가운데 PF 대출비중을 크게 늘렸기 때문에 타격이 크다.
브릿지론이라고 해서 시중은행의 PF대출을 받기 전까지 짧은기간동안 먼저 저축은행이 대출을 해주는건데 시중은행이 대출해준다니까 나름대로 사업성 있다고 보고 대출해준거다.
그런데, 시중은행은 전체 대출금 가운데 PF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
저축은행은 그렇지 않다.
저축은행의 PF 대출잔액은 12조 2천억원.
1년전 11%였던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25%까지 두 배 이상 급등.
지난 2월 저축은행들이 무더기로 영업정지 당하지 않았나.
다 PF 대출 부실 때문이었다.
앞으로도 대출금 회수가 제대로 안되는 저축은행들은 얼마든지 추가로 문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얘기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제와 이슈] PF 덫에 걸린 건설사 ‘줄도산’ 위기
-
- 입력 2011-04-15 16:17:05

<앵커 멘트>
요즘 건설업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제부 박찬형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질문> 이름이 낯익은 기업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어요. 어디 어딥니까?
<답변>
조금 전에 동양건설산업이 법정관리 신청.
이로써 지난해 12월부터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는 모두 7곳으로 늘어.
한달에 한 곳 이상인데요. 지난해 12월 동일토건이 워크아웃, 한솔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
2월엔 월드건설이 워크아웃중에 법정관리를 신청.
효성 계열사인 진흥기업도 워크아웃도 법정관리 신청.
지난달엔 대기업 계열사인 LIG 건설이, 그리고 사흘전엔 국내 건설 면허 1호인 삼부토건이 각각 법정관리 신청.
오늘 동양건설산업.
전체적으론 100대 건설사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28개 건설사가 현재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중.
<질문> 건설사들이 이렇게 갑자기 부실해진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답변>
바로 PF 대출 때문.
갑자기 부실해졌다기 보다 스스로 부실을 키워온 면이 크다.
먼저 따져볼게 시행사,시공사 스스로 사업성 분석 제대로 해왔느냐.
그것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활황에 기대서 건설사 스스로 사업확대에 열을 올린 게 큰 문제.
2000년대 중반, 부동산 활황기였다.
이때 건설사들 너도나도 수익성 높은 PF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느껴졌을 것.
여기에 대출기관도 문제가 많다.
PF 대출은 건설 시행사가 특별한 담보 없이 사업성만 갖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사업을 하는 것.
대부분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시행사가 자본력이 없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 보증을 건설사들에게 요구했다.
금융기관도 사업성 분석 제대로 안하고 건설사 보증 믿고 대출해줬다는것.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푹 꺼지니까 PF사업 분양이 안 되는 것.
이러하보니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돼 보증을 선 건설사들까지 위험해진 것.
<질문> 그렇다면 건설사들이 금융권에서 이렇게 빌린 PF 대출이 얼마나 됩니까?
<답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무려 66조 원.
이 가운데 10대 건설사의 PF 대출만 22조 원.
금리가 오르면서 1년 이자만 1조 원을 넘는다.
앞으로 이런 자금압박은 더 심해질 전망.
건설사가 일을 해야 돈을 갚을텐데 현재 건설경기 불황으로 쉽지 않은 상황.
앞으로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의 말 들어보자.
<인터뷰> 김현아(건설산업연구원) :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원활하지 않을때는 시공사의 부실은 물론 시공사와 차주관계에 있는 금융기관에 부실까지 확산될수 있는 연계고리를 갖고 있어서..."
<질문> 지금 김 연구위원 말처럼 금융기관 부실까지도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 또 문제인것 같습니다. 금융기관은 어떻습니까?
<답변>
금융기관도 알다시피 부실해지고 있다.
바로 저축은행들이다.
전체 금융기관의 PF 대출 연체율은 2년전 6% 정도였다가, 지난해 말에는 13%까지 급등.
문제는 저축은행이라고 했지, 저축은행은 전체 대출금 가운데 PF 대출비중을 크게 늘렸기 때문에 타격이 크다.
브릿지론이라고 해서 시중은행의 PF대출을 받기 전까지 짧은기간동안 먼저 저축은행이 대출을 해주는건데 시중은행이 대출해준다니까 나름대로 사업성 있다고 보고 대출해준거다.
그런데, 시중은행은 전체 대출금 가운데 PF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
저축은행은 그렇지 않다.
저축은행의 PF 대출잔액은 12조 2천억원.
1년전 11%였던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25%까지 두 배 이상 급등.
지난 2월 저축은행들이 무더기로 영업정지 당하지 않았나.
다 PF 대출 부실 때문이었다.
앞으로도 대출금 회수가 제대로 안되는 저축은행들은 얼마든지 추가로 문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얘기다.
-
-

박찬형 기자 parkchan@kbs.co.kr
박찬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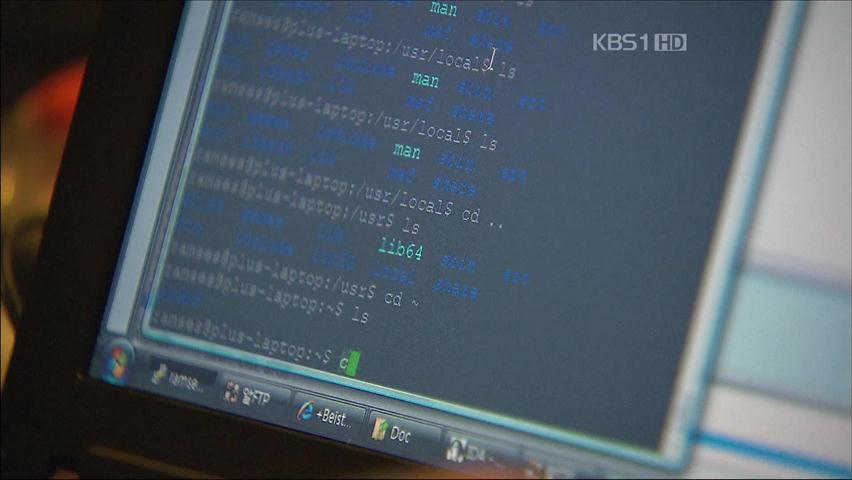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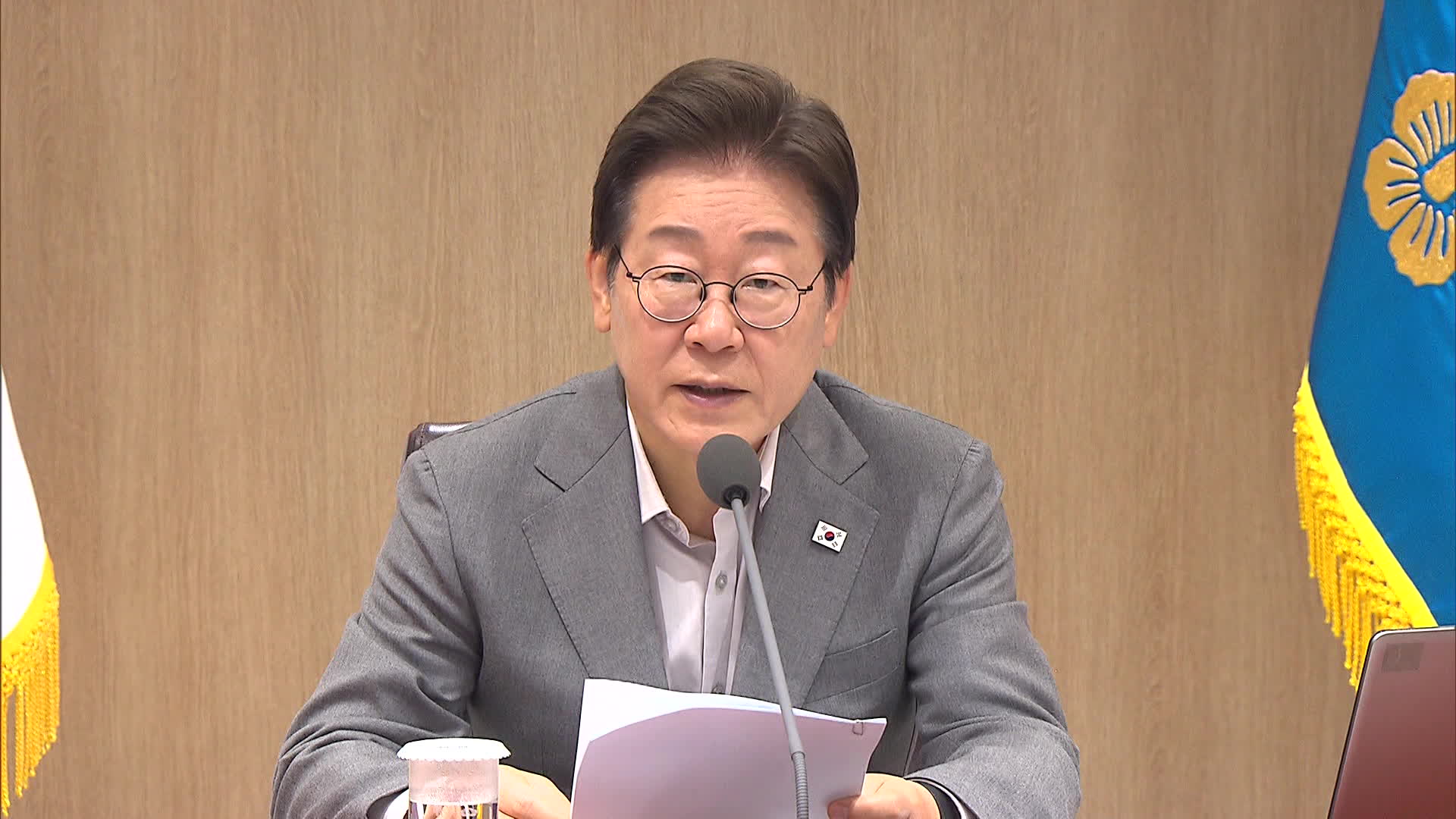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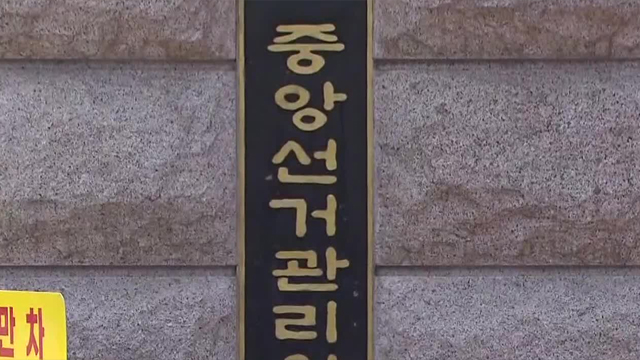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