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가 발생한 우면산은 그야말로 처참한 모습입니다.
주변 가옥들은 완전히 부서졌고, 수십 명의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수도 서울의 도시 기능이 이처럼 속수무책으로 마비된 이유는 무엇인지, 또 해마다 비슷한 일이 되풀이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 지 취재했습니다.
거대한 흙더미가 왕복 8차선 도로를 덮치고 곧장 아파트 단지로 들이닥칩니다.
만 5천톤이나 되는 엄청난 토사는 순식간에 아파트 3층까지 휩쓸었습니다.
산사태는 지난 27일 아침 8시 50분쯤 남태령 전원마을을 덮쳤습니다. 이어 방배동 아파트 단지와 우면동 형촌마을을 차례로 휩쓸었습니다.
그나마 아파트가 토사 등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해 더 큰 피해를 막아준 셈입니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밤낮 없는 복구에 매달렸지만, 흙과 쓰레기 더미로 뒤덮인 남부순환로가 정상을 되찾는 데만 이틀이 걸렸습니다.
서울의 부촌으로 꼽히던 인근 주택가는 온통 뻘밭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최근 우면산에서 이어진 생태공원 공사가대형 산사태를 불렀다고 입을 모읍니다.
<인터뷰> 이경옥(서울시 서초동) : "불만들이 많았어요. 주민들이. 공사 한다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지."
<인터뷰> 피해 아파트 주민 : "자연 그대로 나둬야 하는데, 인간이 그냥 훼손한거죠 다. 훼손해서 이렇게 재앙을 만난 거라고 생각해요. 보기 좋으면 뭐해요. 자연이 싫어하는 걸."
산사태를 맞은 우면산 내 생태공원은 어디가 공원 자리였는 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생태공원을 만든다며 산허리에 목재 계단을 설치하고 인공 호수와 계곡까지 만들었지만, 폭우에 대한 대비는 미흡했습니다.
<인터뷰> 이수곤(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 "서울시 차원에서 우면산 자락을 도시계획해 줄 때는 이미 상부의 산 지역에 사방댐을 충분히 설치해서 산사태가 안 나도록 해주고 하부 지역을 개발했어야죠."
주민들은 인공 호수에 수량을 조절하는 수문도 있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용재(우면생태공원 인근 주민) : "저수지가 있으면 저수지에 대한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책임자가 없더라고요. 산책로 계단목이 전부 떠내려 온 거예요. 그게 막히니까, 물이 못 넘어오고 수위가 올라가니까 물둑이 터진 거죠."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에도 이 지역이 물바다가 되고 수천여 그루의 나무가 뽑혀 인근을 덮쳤습니다.
사전 경고가 있었던 셈이지만, 그동안 이렇다할 예방 조치는 없었고 결국 채 1년도 되기 전에 대형 산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인터뷰> 조원철(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 "각종 시설을 만들 때 고려하지 않았던 재해요소들이 이번에 그대로 추가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자연재해이고, 거기에 우리가 각종 시설을 하면서 고려해야 할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번 우면산 산사태로 숨진 사람은 모두 16명...20여 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 강남 한복판도 이번 폭우로 도심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학원가로 유명한 대치동 사거리는 출근길에 물바다로 변했고, 갑자기 불어난 물에 많은 시민들이 차를 포기하고 앞다퉈 대피했습니다.
버스까지 물에 잠길 정도로 물은 가파르게 차 올랐습니다.
초고층 빌딩들이 밀집한 강남역 부근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녹취> "왼쪽으로는 가능한데 오른쪽으로는 물이 차 있어서 아예 못 들어갑니다."
이번 폭우로 서울 강남에서는 7천여 가구의 물과 전기도 끊겼습니다.
서울시와 지자체는 100년 만의 폭우 때문이라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녹취> 최창제(서울 서초구 부구청장) : "서초구의 경우 오전 6시 50분부터 8시 50분까지 2시간 당 최대 강우량이 164mm로, 100년 빈도의 2시간 당 156mm보다 훨씬 많은 비가 내려서 피해가 커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
서울 반포의 빗물 펌프장입니다.
강남 일대에 내린 빗물이 반포천으로 흘러와 이 곳에 모이면 최종적으로 한강에 보내집니다.
바로 옆에는 물이 일시적으로 불어나 처리 용량을 초과할 경우에 대비한 유수지가 있습니다.
면적은 5.6헥타르, 평소에는 운동장으로 사용하지만, 14만 톤의 물을 가둘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27일 오전, 이 유수지를 제대로 활용했을까.
<녹취> "27일 날 시간이 오전 7시 40분인가에 (물 내보냈어요)(오전 7시 40분이요?) 네, 구청장님이 직접 여기 오셨어요."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빗물펌프장을 촬영한 cctv입니다.
빗물펌프장의 하수관이 넘치자, 오전 8시 40분 가까이 돼서야 유수지로 물을 넣기 시작합니다.
이미 강남 일대가 완전히 물바다로 변한 뒤였습니다.
늑장대처만 하지 않았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얘깁니다.
<녹취> 정창삼(인덕대 토목환경설계공학과 교수) : "결국은 여기서(반포 빗물펌프처리장) 물이 못 빠져나가고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대기 시간이 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유수지) 좀 더 채워줬다면 도심에 있던 물들이 여기에 와 있었겠죠. 그런데 이 물이 대기하고 있었던 상태가 되는 거죠."
수도 서울의 상징이자, 심장인 광화문 광장.
지난해 추석 연휴 때 큰 물난리를 겪었지만, 이번에도 침수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산 쪽에서 물이 내려와 배수가 특히 중요한 곳이지만, 촘촘한 구조의 화강암과 대리석 인도가 설치돼 있어 빗물이 빠질 구멍은 턱 없이 부족합니다.
<인터뷰>염형철(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홍수 때 유출되는 빗물의 양이 약 5배 정도 늘어난 상탭니다. 그런데 디자인서울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콘크리트들을 더욱 강하게 바르고 그 틈까지도 촘촘하게 메웠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이 빠지지 않는"
지난해 수해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 광화문 네거리 밑의 지하 하수관 공사 조차 아직 끝마치지 못했습니다.
당초 7월 중순까지 완공을 할 계획이었지만, 공정률은 아직 70%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터뷰>정창삼(인덕대 토목환경설계공학과 교수) : "C字형으로 공사가 과거에 이뤄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의 흐름이 여기 와서 막히는 거죠. 지난해와는 현재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달라진 점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간당 75밀리미터의 비를 소화할 수 있는 현재의 하수관 기준을 시간당 95밀리미터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이뤄진 구간은 5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조원철(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 : "우리는 방재사업하는 걸 전부 낭비로 보고 있거든요. 왜? 생색이 안 나니까. 정치적으로 생색이 안 나는 사업이다보니까, 이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 날은 지난 1970년 대에는 12일.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는 37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장마가 끝났다 하더라도 강우량이 장마철보다 더 많은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습적인 폭우가 이제 기상 이변이 아닌 일상적인 현상으로 바뀐 겁니다.
도시 홍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인터뷰> 심재현(국립방재연구소 연구실장) : "도시화가 됐을 때는 그 지역 지역에서 조그마한 시설이라도 빗물을 가둬 둘 수 있는 일시적으로, 아니면 땅속으로 개발하기 이전의 상태처럼 물들이 스며들 수 있는 보도 블럭이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 시설로 바꾸자는 거죠."
서울 우면산 산사태와 도심의 물난리는 무분별한 자연 개발과 부실한 관리로 인한피해가 얼마나 큰 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일상화된 기상 상황의 변화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년 만의 폭우라며 하늘 탓만 할 게 아니라 도시 방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변 가옥들은 완전히 부서졌고, 수십 명의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수도 서울의 도시 기능이 이처럼 속수무책으로 마비된 이유는 무엇인지, 또 해마다 비슷한 일이 되풀이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 지 취재했습니다.
거대한 흙더미가 왕복 8차선 도로를 덮치고 곧장 아파트 단지로 들이닥칩니다.
만 5천톤이나 되는 엄청난 토사는 순식간에 아파트 3층까지 휩쓸었습니다.
산사태는 지난 27일 아침 8시 50분쯤 남태령 전원마을을 덮쳤습니다. 이어 방배동 아파트 단지와 우면동 형촌마을을 차례로 휩쓸었습니다.
그나마 아파트가 토사 등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해 더 큰 피해를 막아준 셈입니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밤낮 없는 복구에 매달렸지만, 흙과 쓰레기 더미로 뒤덮인 남부순환로가 정상을 되찾는 데만 이틀이 걸렸습니다.
서울의 부촌으로 꼽히던 인근 주택가는 온통 뻘밭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최근 우면산에서 이어진 생태공원 공사가대형 산사태를 불렀다고 입을 모읍니다.
<인터뷰> 이경옥(서울시 서초동) : "불만들이 많았어요. 주민들이. 공사 한다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지."
<인터뷰> 피해 아파트 주민 : "자연 그대로 나둬야 하는데, 인간이 그냥 훼손한거죠 다. 훼손해서 이렇게 재앙을 만난 거라고 생각해요. 보기 좋으면 뭐해요. 자연이 싫어하는 걸."
산사태를 맞은 우면산 내 생태공원은 어디가 공원 자리였는 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생태공원을 만든다며 산허리에 목재 계단을 설치하고 인공 호수와 계곡까지 만들었지만, 폭우에 대한 대비는 미흡했습니다.
<인터뷰> 이수곤(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 "서울시 차원에서 우면산 자락을 도시계획해 줄 때는 이미 상부의 산 지역에 사방댐을 충분히 설치해서 산사태가 안 나도록 해주고 하부 지역을 개발했어야죠."
주민들은 인공 호수에 수량을 조절하는 수문도 있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용재(우면생태공원 인근 주민) : "저수지가 있으면 저수지에 대한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책임자가 없더라고요. 산책로 계단목이 전부 떠내려 온 거예요. 그게 막히니까, 물이 못 넘어오고 수위가 올라가니까 물둑이 터진 거죠."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에도 이 지역이 물바다가 되고 수천여 그루의 나무가 뽑혀 인근을 덮쳤습니다.
사전 경고가 있었던 셈이지만, 그동안 이렇다할 예방 조치는 없었고 결국 채 1년도 되기 전에 대형 산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인터뷰> 조원철(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 "각종 시설을 만들 때 고려하지 않았던 재해요소들이 이번에 그대로 추가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자연재해이고, 거기에 우리가 각종 시설을 하면서 고려해야 할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번 우면산 산사태로 숨진 사람은 모두 16명...20여 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 강남 한복판도 이번 폭우로 도심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학원가로 유명한 대치동 사거리는 출근길에 물바다로 변했고, 갑자기 불어난 물에 많은 시민들이 차를 포기하고 앞다퉈 대피했습니다.
버스까지 물에 잠길 정도로 물은 가파르게 차 올랐습니다.
초고층 빌딩들이 밀집한 강남역 부근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녹취> "왼쪽으로는 가능한데 오른쪽으로는 물이 차 있어서 아예 못 들어갑니다."
이번 폭우로 서울 강남에서는 7천여 가구의 물과 전기도 끊겼습니다.
서울시와 지자체는 100년 만의 폭우 때문이라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녹취> 최창제(서울 서초구 부구청장) : "서초구의 경우 오전 6시 50분부터 8시 50분까지 2시간 당 최대 강우량이 164mm로, 100년 빈도의 2시간 당 156mm보다 훨씬 많은 비가 내려서 피해가 커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
서울 반포의 빗물 펌프장입니다.
강남 일대에 내린 빗물이 반포천으로 흘러와 이 곳에 모이면 최종적으로 한강에 보내집니다.
바로 옆에는 물이 일시적으로 불어나 처리 용량을 초과할 경우에 대비한 유수지가 있습니다.
면적은 5.6헥타르, 평소에는 운동장으로 사용하지만, 14만 톤의 물을 가둘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27일 오전, 이 유수지를 제대로 활용했을까.
<녹취> "27일 날 시간이 오전 7시 40분인가에 (물 내보냈어요)(오전 7시 40분이요?) 네, 구청장님이 직접 여기 오셨어요."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빗물펌프장을 촬영한 cctv입니다.
빗물펌프장의 하수관이 넘치자, 오전 8시 40분 가까이 돼서야 유수지로 물을 넣기 시작합니다.
이미 강남 일대가 완전히 물바다로 변한 뒤였습니다.
늑장대처만 하지 않았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얘깁니다.
<녹취> 정창삼(인덕대 토목환경설계공학과 교수) : "결국은 여기서(반포 빗물펌프처리장) 물이 못 빠져나가고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대기 시간이 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유수지) 좀 더 채워줬다면 도심에 있던 물들이 여기에 와 있었겠죠. 그런데 이 물이 대기하고 있었던 상태가 되는 거죠."
수도 서울의 상징이자, 심장인 광화문 광장.
지난해 추석 연휴 때 큰 물난리를 겪었지만, 이번에도 침수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산 쪽에서 물이 내려와 배수가 특히 중요한 곳이지만, 촘촘한 구조의 화강암과 대리석 인도가 설치돼 있어 빗물이 빠질 구멍은 턱 없이 부족합니다.
<인터뷰>염형철(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홍수 때 유출되는 빗물의 양이 약 5배 정도 늘어난 상탭니다. 그런데 디자인서울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콘크리트들을 더욱 강하게 바르고 그 틈까지도 촘촘하게 메웠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이 빠지지 않는"
지난해 수해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 광화문 네거리 밑의 지하 하수관 공사 조차 아직 끝마치지 못했습니다.
당초 7월 중순까지 완공을 할 계획이었지만, 공정률은 아직 70%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터뷰>정창삼(인덕대 토목환경설계공학과 교수) : "C字형으로 공사가 과거에 이뤄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의 흐름이 여기 와서 막히는 거죠. 지난해와는 현재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달라진 점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간당 75밀리미터의 비를 소화할 수 있는 현재의 하수관 기준을 시간당 95밀리미터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이뤄진 구간은 5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조원철(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 : "우리는 방재사업하는 걸 전부 낭비로 보고 있거든요. 왜? 생색이 안 나니까. 정치적으로 생색이 안 나는 사업이다보니까, 이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 날은 지난 1970년 대에는 12일.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는 37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장마가 끝났다 하더라도 강우량이 장마철보다 더 많은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습적인 폭우가 이제 기상 이변이 아닌 일상적인 현상으로 바뀐 겁니다.
도시 홍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인터뷰> 심재현(국립방재연구소 연구실장) : "도시화가 됐을 때는 그 지역 지역에서 조그마한 시설이라도 빗물을 가둬 둘 수 있는 일시적으로, 아니면 땅속으로 개발하기 이전의 상태처럼 물들이 스며들 수 있는 보도 블럭이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 시설로 바꾸자는 거죠."
서울 우면산 산사태와 도심의 물난리는 무분별한 자연 개발과 부실한 관리로 인한피해가 얼마나 큰 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일상화된 기상 상황의 변화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년 만의 폭우라며 하늘 탓만 할 게 아니라 도시 방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무방비 서울
-
- 입력 2011-08-01 08:00:39
- 수정2011-08-01 10:02:18

산사태가 발생한 우면산은 그야말로 처참한 모습입니다.
주변 가옥들은 완전히 부서졌고, 수십 명의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수도 서울의 도시 기능이 이처럼 속수무책으로 마비된 이유는 무엇인지, 또 해마다 비슷한 일이 되풀이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 지 취재했습니다.
거대한 흙더미가 왕복 8차선 도로를 덮치고 곧장 아파트 단지로 들이닥칩니다.
만 5천톤이나 되는 엄청난 토사는 순식간에 아파트 3층까지 휩쓸었습니다.
산사태는 지난 27일 아침 8시 50분쯤 남태령 전원마을을 덮쳤습니다. 이어 방배동 아파트 단지와 우면동 형촌마을을 차례로 휩쓸었습니다.
그나마 아파트가 토사 등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해 더 큰 피해를 막아준 셈입니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밤낮 없는 복구에 매달렸지만, 흙과 쓰레기 더미로 뒤덮인 남부순환로가 정상을 되찾는 데만 이틀이 걸렸습니다.
서울의 부촌으로 꼽히던 인근 주택가는 온통 뻘밭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최근 우면산에서 이어진 생태공원 공사가대형 산사태를 불렀다고 입을 모읍니다.
<인터뷰> 이경옥(서울시 서초동) : "불만들이 많았어요. 주민들이. 공사 한다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지."
<인터뷰> 피해 아파트 주민 : "자연 그대로 나둬야 하는데, 인간이 그냥 훼손한거죠 다. 훼손해서 이렇게 재앙을 만난 거라고 생각해요. 보기 좋으면 뭐해요. 자연이 싫어하는 걸."
산사태를 맞은 우면산 내 생태공원은 어디가 공원 자리였는 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생태공원을 만든다며 산허리에 목재 계단을 설치하고 인공 호수와 계곡까지 만들었지만, 폭우에 대한 대비는 미흡했습니다.
<인터뷰> 이수곤(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 "서울시 차원에서 우면산 자락을 도시계획해 줄 때는 이미 상부의 산 지역에 사방댐을 충분히 설치해서 산사태가 안 나도록 해주고 하부 지역을 개발했어야죠."
주민들은 인공 호수에 수량을 조절하는 수문도 있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용재(우면생태공원 인근 주민) : "저수지가 있으면 저수지에 대한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책임자가 없더라고요. 산책로 계단목이 전부 떠내려 온 거예요. 그게 막히니까, 물이 못 넘어오고 수위가 올라가니까 물둑이 터진 거죠."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에도 이 지역이 물바다가 되고 수천여 그루의 나무가 뽑혀 인근을 덮쳤습니다.
사전 경고가 있었던 셈이지만, 그동안 이렇다할 예방 조치는 없었고 결국 채 1년도 되기 전에 대형 산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인터뷰> 조원철(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 "각종 시설을 만들 때 고려하지 않았던 재해요소들이 이번에 그대로 추가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자연재해이고, 거기에 우리가 각종 시설을 하면서 고려해야 할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번 우면산 산사태로 숨진 사람은 모두 16명...20여 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 강남 한복판도 이번 폭우로 도심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학원가로 유명한 대치동 사거리는 출근길에 물바다로 변했고, 갑자기 불어난 물에 많은 시민들이 차를 포기하고 앞다퉈 대피했습니다.
버스까지 물에 잠길 정도로 물은 가파르게 차 올랐습니다.
초고층 빌딩들이 밀집한 강남역 부근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녹취> "왼쪽으로는 가능한데 오른쪽으로는 물이 차 있어서 아예 못 들어갑니다."
이번 폭우로 서울 강남에서는 7천여 가구의 물과 전기도 끊겼습니다.
서울시와 지자체는 100년 만의 폭우 때문이라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녹취> 최창제(서울 서초구 부구청장) : "서초구의 경우 오전 6시 50분부터 8시 50분까지 2시간 당 최대 강우량이 164mm로, 100년 빈도의 2시간 당 156mm보다 훨씬 많은 비가 내려서 피해가 커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
서울 반포의 빗물 펌프장입니다.
강남 일대에 내린 빗물이 반포천으로 흘러와 이 곳에 모이면 최종적으로 한강에 보내집니다.
바로 옆에는 물이 일시적으로 불어나 처리 용량을 초과할 경우에 대비한 유수지가 있습니다.
면적은 5.6헥타르, 평소에는 운동장으로 사용하지만, 14만 톤의 물을 가둘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27일 오전, 이 유수지를 제대로 활용했을까.
<녹취> "27일 날 시간이 오전 7시 40분인가에 (물 내보냈어요)(오전 7시 40분이요?) 네, 구청장님이 직접 여기 오셨어요."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빗물펌프장을 촬영한 cctv입니다.
빗물펌프장의 하수관이 넘치자, 오전 8시 40분 가까이 돼서야 유수지로 물을 넣기 시작합니다.
이미 강남 일대가 완전히 물바다로 변한 뒤였습니다.
늑장대처만 하지 않았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얘깁니다.
<녹취> 정창삼(인덕대 토목환경설계공학과 교수) : "결국은 여기서(반포 빗물펌프처리장) 물이 못 빠져나가고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대기 시간이 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유수지) 좀 더 채워줬다면 도심에 있던 물들이 여기에 와 있었겠죠. 그런데 이 물이 대기하고 있었던 상태가 되는 거죠."
수도 서울의 상징이자, 심장인 광화문 광장.
지난해 추석 연휴 때 큰 물난리를 겪었지만, 이번에도 침수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산 쪽에서 물이 내려와 배수가 특히 중요한 곳이지만, 촘촘한 구조의 화강암과 대리석 인도가 설치돼 있어 빗물이 빠질 구멍은 턱 없이 부족합니다.
<인터뷰>염형철(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홍수 때 유출되는 빗물의 양이 약 5배 정도 늘어난 상탭니다. 그런데 디자인서울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콘크리트들을 더욱 강하게 바르고 그 틈까지도 촘촘하게 메웠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이 빠지지 않는"
지난해 수해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 광화문 네거리 밑의 지하 하수관 공사 조차 아직 끝마치지 못했습니다.
당초 7월 중순까지 완공을 할 계획이었지만, 공정률은 아직 70%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터뷰>정창삼(인덕대 토목환경설계공학과 교수) : "C字형으로 공사가 과거에 이뤄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의 흐름이 여기 와서 막히는 거죠. 지난해와는 현재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달라진 점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간당 75밀리미터의 비를 소화할 수 있는 현재의 하수관 기준을 시간당 95밀리미터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이뤄진 구간은 5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조원철(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 : "우리는 방재사업하는 걸 전부 낭비로 보고 있거든요. 왜? 생색이 안 나니까. 정치적으로 생색이 안 나는 사업이다보니까, 이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 날은 지난 1970년 대에는 12일.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는 37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장마가 끝났다 하더라도 강우량이 장마철보다 더 많은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습적인 폭우가 이제 기상 이변이 아닌 일상적인 현상으로 바뀐 겁니다.
도시 홍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인터뷰> 심재현(국립방재연구소 연구실장) : "도시화가 됐을 때는 그 지역 지역에서 조그마한 시설이라도 빗물을 가둬 둘 수 있는 일시적으로, 아니면 땅속으로 개발하기 이전의 상태처럼 물들이 스며들 수 있는 보도 블럭이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 시설로 바꾸자는 거죠."
서울 우면산 산사태와 도심의 물난리는 무분별한 자연 개발과 부실한 관리로 인한피해가 얼마나 큰 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일상화된 기상 상황의 변화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년 만의 폭우라며 하늘 탓만 할 게 아니라 도시 방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변 가옥들은 완전히 부서졌고, 수십 명의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수도 서울의 도시 기능이 이처럼 속수무책으로 마비된 이유는 무엇인지, 또 해마다 비슷한 일이 되풀이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 지 취재했습니다.
거대한 흙더미가 왕복 8차선 도로를 덮치고 곧장 아파트 단지로 들이닥칩니다.
만 5천톤이나 되는 엄청난 토사는 순식간에 아파트 3층까지 휩쓸었습니다.
산사태는 지난 27일 아침 8시 50분쯤 남태령 전원마을을 덮쳤습니다. 이어 방배동 아파트 단지와 우면동 형촌마을을 차례로 휩쓸었습니다.
그나마 아파트가 토사 등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해 더 큰 피해를 막아준 셈입니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밤낮 없는 복구에 매달렸지만, 흙과 쓰레기 더미로 뒤덮인 남부순환로가 정상을 되찾는 데만 이틀이 걸렸습니다.
서울의 부촌으로 꼽히던 인근 주택가는 온통 뻘밭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최근 우면산에서 이어진 생태공원 공사가대형 산사태를 불렀다고 입을 모읍니다.
<인터뷰> 이경옥(서울시 서초동) : "불만들이 많았어요. 주민들이. 공사 한다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지."
<인터뷰> 피해 아파트 주민 : "자연 그대로 나둬야 하는데, 인간이 그냥 훼손한거죠 다. 훼손해서 이렇게 재앙을 만난 거라고 생각해요. 보기 좋으면 뭐해요. 자연이 싫어하는 걸."
산사태를 맞은 우면산 내 생태공원은 어디가 공원 자리였는 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생태공원을 만든다며 산허리에 목재 계단을 설치하고 인공 호수와 계곡까지 만들었지만, 폭우에 대한 대비는 미흡했습니다.
<인터뷰> 이수곤(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 "서울시 차원에서 우면산 자락을 도시계획해 줄 때는 이미 상부의 산 지역에 사방댐을 충분히 설치해서 산사태가 안 나도록 해주고 하부 지역을 개발했어야죠."
주민들은 인공 호수에 수량을 조절하는 수문도 있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용재(우면생태공원 인근 주민) : "저수지가 있으면 저수지에 대한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책임자가 없더라고요. 산책로 계단목이 전부 떠내려 온 거예요. 그게 막히니까, 물이 못 넘어오고 수위가 올라가니까 물둑이 터진 거죠."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에도 이 지역이 물바다가 되고 수천여 그루의 나무가 뽑혀 인근을 덮쳤습니다.
사전 경고가 있었던 셈이지만, 그동안 이렇다할 예방 조치는 없었고 결국 채 1년도 되기 전에 대형 산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인터뷰> 조원철(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 "각종 시설을 만들 때 고려하지 않았던 재해요소들이 이번에 그대로 추가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자연재해이고, 거기에 우리가 각종 시설을 하면서 고려해야 할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번 우면산 산사태로 숨진 사람은 모두 16명...20여 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 강남 한복판도 이번 폭우로 도심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학원가로 유명한 대치동 사거리는 출근길에 물바다로 변했고, 갑자기 불어난 물에 많은 시민들이 차를 포기하고 앞다퉈 대피했습니다.
버스까지 물에 잠길 정도로 물은 가파르게 차 올랐습니다.
초고층 빌딩들이 밀집한 강남역 부근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녹취> "왼쪽으로는 가능한데 오른쪽으로는 물이 차 있어서 아예 못 들어갑니다."
이번 폭우로 서울 강남에서는 7천여 가구의 물과 전기도 끊겼습니다.
서울시와 지자체는 100년 만의 폭우 때문이라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녹취> 최창제(서울 서초구 부구청장) : "서초구의 경우 오전 6시 50분부터 8시 50분까지 2시간 당 최대 강우량이 164mm로, 100년 빈도의 2시간 당 156mm보다 훨씬 많은 비가 내려서 피해가 커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
서울 반포의 빗물 펌프장입니다.
강남 일대에 내린 빗물이 반포천으로 흘러와 이 곳에 모이면 최종적으로 한강에 보내집니다.
바로 옆에는 물이 일시적으로 불어나 처리 용량을 초과할 경우에 대비한 유수지가 있습니다.
면적은 5.6헥타르, 평소에는 운동장으로 사용하지만, 14만 톤의 물을 가둘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27일 오전, 이 유수지를 제대로 활용했을까.
<녹취> "27일 날 시간이 오전 7시 40분인가에 (물 내보냈어요)(오전 7시 40분이요?) 네, 구청장님이 직접 여기 오셨어요."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빗물펌프장을 촬영한 cctv입니다.
빗물펌프장의 하수관이 넘치자, 오전 8시 40분 가까이 돼서야 유수지로 물을 넣기 시작합니다.
이미 강남 일대가 완전히 물바다로 변한 뒤였습니다.
늑장대처만 하지 않았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얘깁니다.
<녹취> 정창삼(인덕대 토목환경설계공학과 교수) : "결국은 여기서(반포 빗물펌프처리장) 물이 못 빠져나가고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대기 시간이 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유수지) 좀 더 채워줬다면 도심에 있던 물들이 여기에 와 있었겠죠. 그런데 이 물이 대기하고 있었던 상태가 되는 거죠."
수도 서울의 상징이자, 심장인 광화문 광장.
지난해 추석 연휴 때 큰 물난리를 겪었지만, 이번에도 침수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산 쪽에서 물이 내려와 배수가 특히 중요한 곳이지만, 촘촘한 구조의 화강암과 대리석 인도가 설치돼 있어 빗물이 빠질 구멍은 턱 없이 부족합니다.
<인터뷰>염형철(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홍수 때 유출되는 빗물의 양이 약 5배 정도 늘어난 상탭니다. 그런데 디자인서울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콘크리트들을 더욱 강하게 바르고 그 틈까지도 촘촘하게 메웠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이 빠지지 않는"
지난해 수해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 광화문 네거리 밑의 지하 하수관 공사 조차 아직 끝마치지 못했습니다.
당초 7월 중순까지 완공을 할 계획이었지만, 공정률은 아직 70%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터뷰>정창삼(인덕대 토목환경설계공학과 교수) : "C字형으로 공사가 과거에 이뤄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의 흐름이 여기 와서 막히는 거죠. 지난해와는 현재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달라진 점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간당 75밀리미터의 비를 소화할 수 있는 현재의 하수관 기준을 시간당 95밀리미터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이뤄진 구간은 5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조원철(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 : "우리는 방재사업하는 걸 전부 낭비로 보고 있거든요. 왜? 생색이 안 나니까. 정치적으로 생색이 안 나는 사업이다보니까, 이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 날은 지난 1970년 대에는 12일.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는 37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장마가 끝났다 하더라도 강우량이 장마철보다 더 많은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습적인 폭우가 이제 기상 이변이 아닌 일상적인 현상으로 바뀐 겁니다.
도시 홍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인터뷰> 심재현(국립방재연구소 연구실장) : "도시화가 됐을 때는 그 지역 지역에서 조그마한 시설이라도 빗물을 가둬 둘 수 있는 일시적으로, 아니면 땅속으로 개발하기 이전의 상태처럼 물들이 스며들 수 있는 보도 블럭이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 시설로 바꾸자는 거죠."
서울 우면산 산사태와 도심의 물난리는 무분별한 자연 개발과 부실한 관리로 인한피해가 얼마나 큰 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일상화된 기상 상황의 변화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년 만의 폭우라며 하늘 탓만 할 게 아니라 도시 방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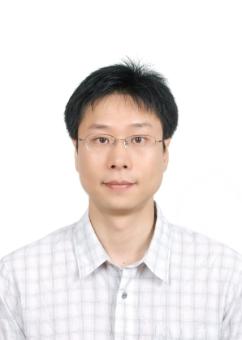
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김시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속보] 청주시, 오송읍 정중리 마을 주민 정중1리 마을 회관으로 대피령](/data/layer/904/2025/07/20250717_r9F49P.jpg)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