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포착] 한 지붕 속 다른 공간, 이색 주택들
입력 2013.05.28 (08:40)
수정 2013.05.28 (10: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런 말이 여기에 딱 어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위기' 속엔 항상 '기회'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음...도시의 심각한 주거 문제가 새로운 발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는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집과 어울려 사는 집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노태영 기자~ 사실 집집마다 천편일률적인 구조가 참 아쉬울 때가 많았거든요,
<기자 멘트>
우리나라는 유난히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은 편인데요
비슷비슷한 구조에 살면서도 또 정작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답답한 주거문화에서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명 코하우징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독립적인 개인주택들이 공동 시설물을 공유하며 이웃을 이뤄 살아가는,, 한마디로 이웃사촌끼리 살아가는 형탭니다.
함께 보시죠.
<리포트>
서울 도심의 한 빌라.
겉으로 봐선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안에서는 특이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층간 소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노는데요. 엄마도 이를 말리기는커녕 태연히 지켜봅니다.
<녹취> 진주리(402호 거주자) : “(어머니, 지금 아이들이 뛰어노는데 아래층에서 뭐라 하지 않아요?) 아뇨, 여긴 그런 걱정 없습니다. 여기 옆집 아이와 밑에 집 아이도 같이 와서 놀거든요.”
단순히 놀러 와 있는 게 아닙니다.
빌라 전체가 한 식구처럼 지내기 때문인데요.
<인터뷰> 진주리(402호 거주자) : “(여기는 어떤 곳인데요?) 여기는 다 한 식구처럼 같이 잘 지내거든요.”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이란 말을 줄여 일명 소행주라 불리는 이 집은 9가구의 가족들이 의견을 맞춰 직접 설계한 곳으로 현관처럼 불필요한 공간은 공동 공간으로 만들었는데요.
집에 두지 않아도 되는 물건들은 공동 창고에 보관을 하고 일반 가정에선 상상하기 힘든 공동 주방에, 작은 평수의 빌라에선 볼 수 없는 넓은 베란다와, 심지어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까지 있습니다.
2년 전 답답한 아파트 주거 문화에서 탈출하기로 뜻을 함께 한 9가구가 모였고 형편에 맞춰 9평부터 26평까지 건축비를 부담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했는데요.
같이 살다 보니 생길 수밖에 없는 고민도 회의를 통해 서로의 마음까지 속속들이 잘 이해할 수 있어 요즘 아파트 문화와는 많이 다릅니다.
<인터뷰> 박진현(301호 거주자) : “한 달에 한 번씩 입주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생활하면서 좀 불편했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의논하고 공유하고 함께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공동 공간만 다른 게 아닙니다.
각 가구의 필요에 따라 개성 있게 지어져 모두가 다른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평생 살고 싶은 보금자리를 각 가정의 특색에 맞게 지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인터뷰> 전홍기혜(202호 거주자) : “나중에 아이가 크면 독립된 공간을 갖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아이 방으로 복층에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알찬 공간을 계획한 만큼 만족도도 높은데요.
<녹취> “(이렇게 이층에 혼자 있으니까 뭐가 좋아요?) 여긴 내 집 같아서 좋아요.”
다락방의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 가족만을 위한 별도의 베란다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아파트처럼 찍어낸 집에 맞춰 개성을 잃어가던 사람들에게 남들과 다른 집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행복 그 자체라고 합니다.
<인터뷰> 전홍기혜(202호 거주자) : “남편이 이 공간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공간을 꾸민 것도 남편이에요. 파라솔 사고 깔판도 사고 본인이 생각해서 만든 공간이에요.”
<녹취> “(어머님 혼자만의 공간은 없네요?) 우리 집이 그냥 제 공간이라서요.”
개성만점의 공간처럼 문화도 독특합니다.
공동 부엌에서는 각 가구 하나씩 반찬을 만들어 나눠 먹고요.
아빠들도 집안일과 육아에 공동으로 참여합니다.
아이들도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 보니 함께 지내고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절로 알게 됩니다.
<인터뷰> 조성욱(402호 거주자) :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옆집에 누가 있는지, 가까운 이웃이 누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살잖아요. 가까운 공간에서 여러사람들하고 각자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눈다는 것에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녹취>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의 행복을 위하여”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택도 있습니다.
전통 한옥의 여유로운 공간을 여러 명이 함께 공유하는 형식인데요.
<인터뷰> 이정호(서울 돈의동) : “가족이랑 살던 게 그리워서 그런 이유가 제일 컸고, 종로에 있는 한옥에서 살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와서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자리가 있어서 지금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원룸의 좁은 방에 어두운 복도 대신 밝은 햇볕이 드는 너른 마당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실이며 부엌도 공유함은 물론 개성 있는 개인 공간까지 가질 수 있어 찾는 이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전문적인 영역의 깊은 대화도 가능하니 혼자 지내는 삶에 비해 정서적으로 아주 유익하다고 합니다.
<인터뷰> 윤선호(서울 돈의동) :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직장 갔다 오면 매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 여기서 같이 이야기하고 소통하다 보니까 정말 즐겁고 스트레스가 저절로 해소되는 것 같아요.”
너무 낡아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골칫거리였던 도심 속 한옥이 간단한 손질로 변신한 것인데요.
1인 가구 독신자들에게도, 집주인에게도 모두 이득이 되는 주거형태입니다.
<인터뷰> 박형수(‘W’하우스 운영개발 팀장) : “1인 가구에서 주지 못하는 같이 사는 즐거움. 그리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할 있어서 집주인이나 세입자에게 둘 다 좋은 혜택들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 주거 문제의 대안으로 떠오르며 개성 만점의 공간까지 연출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주택들.
일상을 가꾸고 사람들과 어울려 소통하는 문화도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여기에 딱 어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위기' 속엔 항상 '기회'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음...도시의 심각한 주거 문제가 새로운 발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는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집과 어울려 사는 집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노태영 기자~ 사실 집집마다 천편일률적인 구조가 참 아쉬울 때가 많았거든요,
<기자 멘트>
우리나라는 유난히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은 편인데요
비슷비슷한 구조에 살면서도 또 정작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답답한 주거문화에서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명 코하우징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독립적인 개인주택들이 공동 시설물을 공유하며 이웃을 이뤄 살아가는,, 한마디로 이웃사촌끼리 살아가는 형탭니다.
함께 보시죠.
<리포트>
서울 도심의 한 빌라.
겉으로 봐선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안에서는 특이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층간 소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노는데요. 엄마도 이를 말리기는커녕 태연히 지켜봅니다.
<녹취> 진주리(402호 거주자) : “(어머니, 지금 아이들이 뛰어노는데 아래층에서 뭐라 하지 않아요?) 아뇨, 여긴 그런 걱정 없습니다. 여기 옆집 아이와 밑에 집 아이도 같이 와서 놀거든요.”
단순히 놀러 와 있는 게 아닙니다.
빌라 전체가 한 식구처럼 지내기 때문인데요.
<인터뷰> 진주리(402호 거주자) : “(여기는 어떤 곳인데요?) 여기는 다 한 식구처럼 같이 잘 지내거든요.”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이란 말을 줄여 일명 소행주라 불리는 이 집은 9가구의 가족들이 의견을 맞춰 직접 설계한 곳으로 현관처럼 불필요한 공간은 공동 공간으로 만들었는데요.
집에 두지 않아도 되는 물건들은 공동 창고에 보관을 하고 일반 가정에선 상상하기 힘든 공동 주방에, 작은 평수의 빌라에선 볼 수 없는 넓은 베란다와, 심지어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까지 있습니다.
2년 전 답답한 아파트 주거 문화에서 탈출하기로 뜻을 함께 한 9가구가 모였고 형편에 맞춰 9평부터 26평까지 건축비를 부담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했는데요.
같이 살다 보니 생길 수밖에 없는 고민도 회의를 통해 서로의 마음까지 속속들이 잘 이해할 수 있어 요즘 아파트 문화와는 많이 다릅니다.
<인터뷰> 박진현(301호 거주자) : “한 달에 한 번씩 입주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생활하면서 좀 불편했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의논하고 공유하고 함께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공동 공간만 다른 게 아닙니다.
각 가구의 필요에 따라 개성 있게 지어져 모두가 다른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평생 살고 싶은 보금자리를 각 가정의 특색에 맞게 지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인터뷰> 전홍기혜(202호 거주자) : “나중에 아이가 크면 독립된 공간을 갖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아이 방으로 복층에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알찬 공간을 계획한 만큼 만족도도 높은데요.
<녹취> “(이렇게 이층에 혼자 있으니까 뭐가 좋아요?) 여긴 내 집 같아서 좋아요.”
다락방의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 가족만을 위한 별도의 베란다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아파트처럼 찍어낸 집에 맞춰 개성을 잃어가던 사람들에게 남들과 다른 집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행복 그 자체라고 합니다.
<인터뷰> 전홍기혜(202호 거주자) : “남편이 이 공간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공간을 꾸민 것도 남편이에요. 파라솔 사고 깔판도 사고 본인이 생각해서 만든 공간이에요.”
<녹취> “(어머님 혼자만의 공간은 없네요?) 우리 집이 그냥 제 공간이라서요.”
개성만점의 공간처럼 문화도 독특합니다.
공동 부엌에서는 각 가구 하나씩 반찬을 만들어 나눠 먹고요.
아빠들도 집안일과 육아에 공동으로 참여합니다.
아이들도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 보니 함께 지내고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절로 알게 됩니다.
<인터뷰> 조성욱(402호 거주자) :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옆집에 누가 있는지, 가까운 이웃이 누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살잖아요. 가까운 공간에서 여러사람들하고 각자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눈다는 것에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녹취>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의 행복을 위하여”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택도 있습니다.
전통 한옥의 여유로운 공간을 여러 명이 함께 공유하는 형식인데요.
<인터뷰> 이정호(서울 돈의동) : “가족이랑 살던 게 그리워서 그런 이유가 제일 컸고, 종로에 있는 한옥에서 살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와서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자리가 있어서 지금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원룸의 좁은 방에 어두운 복도 대신 밝은 햇볕이 드는 너른 마당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실이며 부엌도 공유함은 물론 개성 있는 개인 공간까지 가질 수 있어 찾는 이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전문적인 영역의 깊은 대화도 가능하니 혼자 지내는 삶에 비해 정서적으로 아주 유익하다고 합니다.
<인터뷰> 윤선호(서울 돈의동) :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직장 갔다 오면 매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 여기서 같이 이야기하고 소통하다 보니까 정말 즐겁고 스트레스가 저절로 해소되는 것 같아요.”
너무 낡아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골칫거리였던 도심 속 한옥이 간단한 손질로 변신한 것인데요.
1인 가구 독신자들에게도, 집주인에게도 모두 이득이 되는 주거형태입니다.
<인터뷰> 박형수(‘W’하우스 운영개발 팀장) : “1인 가구에서 주지 못하는 같이 사는 즐거움. 그리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할 있어서 집주인이나 세입자에게 둘 다 좋은 혜택들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 주거 문제의 대안으로 떠오르며 개성 만점의 공간까지 연출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주택들.
일상을 가꾸고 사람들과 어울려 소통하는 문화도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화제포착] 한 지붕 속 다른 공간, 이색 주택들
-
- 입력 2013-05-28 08:56:33
- 수정2013-05-28 10:38:18

<앵커 멘트>
이런 말이 여기에 딱 어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위기' 속엔 항상 '기회'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음...도시의 심각한 주거 문제가 새로운 발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는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집과 어울려 사는 집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노태영 기자~ 사실 집집마다 천편일률적인 구조가 참 아쉬울 때가 많았거든요,
<기자 멘트>
우리나라는 유난히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은 편인데요
비슷비슷한 구조에 살면서도 또 정작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답답한 주거문화에서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명 코하우징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독립적인 개인주택들이 공동 시설물을 공유하며 이웃을 이뤄 살아가는,, 한마디로 이웃사촌끼리 살아가는 형탭니다.
함께 보시죠.
<리포트>
서울 도심의 한 빌라.
겉으로 봐선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안에서는 특이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층간 소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노는데요. 엄마도 이를 말리기는커녕 태연히 지켜봅니다.
<녹취> 진주리(402호 거주자) : “(어머니, 지금 아이들이 뛰어노는데 아래층에서 뭐라 하지 않아요?) 아뇨, 여긴 그런 걱정 없습니다. 여기 옆집 아이와 밑에 집 아이도 같이 와서 놀거든요.”
단순히 놀러 와 있는 게 아닙니다.
빌라 전체가 한 식구처럼 지내기 때문인데요.
<인터뷰> 진주리(402호 거주자) : “(여기는 어떤 곳인데요?) 여기는 다 한 식구처럼 같이 잘 지내거든요.”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이란 말을 줄여 일명 소행주라 불리는 이 집은 9가구의 가족들이 의견을 맞춰 직접 설계한 곳으로 현관처럼 불필요한 공간은 공동 공간으로 만들었는데요.
집에 두지 않아도 되는 물건들은 공동 창고에 보관을 하고 일반 가정에선 상상하기 힘든 공동 주방에, 작은 평수의 빌라에선 볼 수 없는 넓은 베란다와, 심지어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까지 있습니다.
2년 전 답답한 아파트 주거 문화에서 탈출하기로 뜻을 함께 한 9가구가 모였고 형편에 맞춰 9평부터 26평까지 건축비를 부담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했는데요.
같이 살다 보니 생길 수밖에 없는 고민도 회의를 통해 서로의 마음까지 속속들이 잘 이해할 수 있어 요즘 아파트 문화와는 많이 다릅니다.
<인터뷰> 박진현(301호 거주자) : “한 달에 한 번씩 입주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생활하면서 좀 불편했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의논하고 공유하고 함께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공동 공간만 다른 게 아닙니다.
각 가구의 필요에 따라 개성 있게 지어져 모두가 다른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평생 살고 싶은 보금자리를 각 가정의 특색에 맞게 지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인터뷰> 전홍기혜(202호 거주자) : “나중에 아이가 크면 독립된 공간을 갖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아이 방으로 복층에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알찬 공간을 계획한 만큼 만족도도 높은데요.
<녹취> “(이렇게 이층에 혼자 있으니까 뭐가 좋아요?) 여긴 내 집 같아서 좋아요.”
다락방의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 가족만을 위한 별도의 베란다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아파트처럼 찍어낸 집에 맞춰 개성을 잃어가던 사람들에게 남들과 다른 집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행복 그 자체라고 합니다.
<인터뷰> 전홍기혜(202호 거주자) : “남편이 이 공간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공간을 꾸민 것도 남편이에요. 파라솔 사고 깔판도 사고 본인이 생각해서 만든 공간이에요.”
<녹취> “(어머님 혼자만의 공간은 없네요?) 우리 집이 그냥 제 공간이라서요.”
개성만점의 공간처럼 문화도 독특합니다.
공동 부엌에서는 각 가구 하나씩 반찬을 만들어 나눠 먹고요.
아빠들도 집안일과 육아에 공동으로 참여합니다.
아이들도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 보니 함께 지내고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절로 알게 됩니다.
<인터뷰> 조성욱(402호 거주자) :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옆집에 누가 있는지, 가까운 이웃이 누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살잖아요. 가까운 공간에서 여러사람들하고 각자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눈다는 것에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녹취>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의 행복을 위하여”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택도 있습니다.
전통 한옥의 여유로운 공간을 여러 명이 함께 공유하는 형식인데요.
<인터뷰> 이정호(서울 돈의동) : “가족이랑 살던 게 그리워서 그런 이유가 제일 컸고, 종로에 있는 한옥에서 살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와서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자리가 있어서 지금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원룸의 좁은 방에 어두운 복도 대신 밝은 햇볕이 드는 너른 마당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실이며 부엌도 공유함은 물론 개성 있는 개인 공간까지 가질 수 있어 찾는 이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전문적인 영역의 깊은 대화도 가능하니 혼자 지내는 삶에 비해 정서적으로 아주 유익하다고 합니다.
<인터뷰> 윤선호(서울 돈의동) :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직장 갔다 오면 매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 여기서 같이 이야기하고 소통하다 보니까 정말 즐겁고 스트레스가 저절로 해소되는 것 같아요.”
너무 낡아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골칫거리였던 도심 속 한옥이 간단한 손질로 변신한 것인데요.
1인 가구 독신자들에게도, 집주인에게도 모두 이득이 되는 주거형태입니다.
<인터뷰> 박형수(‘W’하우스 운영개발 팀장) : “1인 가구에서 주지 못하는 같이 사는 즐거움. 그리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할 있어서 집주인이나 세입자에게 둘 다 좋은 혜택들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 주거 문제의 대안으로 떠오르며 개성 만점의 공간까지 연출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주택들.
일상을 가꾸고 사람들과 어울려 소통하는 문화도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여기에 딱 어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위기' 속엔 항상 '기회'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음...도시의 심각한 주거 문제가 새로운 발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는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집과 어울려 사는 집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노태영 기자~ 사실 집집마다 천편일률적인 구조가 참 아쉬울 때가 많았거든요,
<기자 멘트>
우리나라는 유난히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은 편인데요
비슷비슷한 구조에 살면서도 또 정작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답답한 주거문화에서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명 코하우징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독립적인 개인주택들이 공동 시설물을 공유하며 이웃을 이뤄 살아가는,, 한마디로 이웃사촌끼리 살아가는 형탭니다.
함께 보시죠.
<리포트>
서울 도심의 한 빌라.
겉으로 봐선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안에서는 특이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층간 소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노는데요. 엄마도 이를 말리기는커녕 태연히 지켜봅니다.
<녹취> 진주리(402호 거주자) : “(어머니, 지금 아이들이 뛰어노는데 아래층에서 뭐라 하지 않아요?) 아뇨, 여긴 그런 걱정 없습니다. 여기 옆집 아이와 밑에 집 아이도 같이 와서 놀거든요.”
단순히 놀러 와 있는 게 아닙니다.
빌라 전체가 한 식구처럼 지내기 때문인데요.
<인터뷰> 진주리(402호 거주자) : “(여기는 어떤 곳인데요?) 여기는 다 한 식구처럼 같이 잘 지내거든요.”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이란 말을 줄여 일명 소행주라 불리는 이 집은 9가구의 가족들이 의견을 맞춰 직접 설계한 곳으로 현관처럼 불필요한 공간은 공동 공간으로 만들었는데요.
집에 두지 않아도 되는 물건들은 공동 창고에 보관을 하고 일반 가정에선 상상하기 힘든 공동 주방에, 작은 평수의 빌라에선 볼 수 없는 넓은 베란다와, 심지어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까지 있습니다.
2년 전 답답한 아파트 주거 문화에서 탈출하기로 뜻을 함께 한 9가구가 모였고 형편에 맞춰 9평부터 26평까지 건축비를 부담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했는데요.
같이 살다 보니 생길 수밖에 없는 고민도 회의를 통해 서로의 마음까지 속속들이 잘 이해할 수 있어 요즘 아파트 문화와는 많이 다릅니다.
<인터뷰> 박진현(301호 거주자) : “한 달에 한 번씩 입주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생활하면서 좀 불편했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의논하고 공유하고 함께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공동 공간만 다른 게 아닙니다.
각 가구의 필요에 따라 개성 있게 지어져 모두가 다른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평생 살고 싶은 보금자리를 각 가정의 특색에 맞게 지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인터뷰> 전홍기혜(202호 거주자) : “나중에 아이가 크면 독립된 공간을 갖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아이 방으로 복층에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알찬 공간을 계획한 만큼 만족도도 높은데요.
<녹취> “(이렇게 이층에 혼자 있으니까 뭐가 좋아요?) 여긴 내 집 같아서 좋아요.”
다락방의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 가족만을 위한 별도의 베란다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아파트처럼 찍어낸 집에 맞춰 개성을 잃어가던 사람들에게 남들과 다른 집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행복 그 자체라고 합니다.
<인터뷰> 전홍기혜(202호 거주자) : “남편이 이 공간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공간을 꾸민 것도 남편이에요. 파라솔 사고 깔판도 사고 본인이 생각해서 만든 공간이에요.”
<녹취> “(어머님 혼자만의 공간은 없네요?) 우리 집이 그냥 제 공간이라서요.”
개성만점의 공간처럼 문화도 독특합니다.
공동 부엌에서는 각 가구 하나씩 반찬을 만들어 나눠 먹고요.
아빠들도 집안일과 육아에 공동으로 참여합니다.
아이들도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 보니 함께 지내고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절로 알게 됩니다.
<인터뷰> 조성욱(402호 거주자) :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옆집에 누가 있는지, 가까운 이웃이 누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살잖아요. 가까운 공간에서 여러사람들하고 각자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눈다는 것에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녹취>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의 행복을 위하여”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택도 있습니다.
전통 한옥의 여유로운 공간을 여러 명이 함께 공유하는 형식인데요.
<인터뷰> 이정호(서울 돈의동) : “가족이랑 살던 게 그리워서 그런 이유가 제일 컸고, 종로에 있는 한옥에서 살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와서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자리가 있어서 지금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원룸의 좁은 방에 어두운 복도 대신 밝은 햇볕이 드는 너른 마당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실이며 부엌도 공유함은 물론 개성 있는 개인 공간까지 가질 수 있어 찾는 이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전문적인 영역의 깊은 대화도 가능하니 혼자 지내는 삶에 비해 정서적으로 아주 유익하다고 합니다.
<인터뷰> 윤선호(서울 돈의동) :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직장 갔다 오면 매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 여기서 같이 이야기하고 소통하다 보니까 정말 즐겁고 스트레스가 저절로 해소되는 것 같아요.”
너무 낡아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골칫거리였던 도심 속 한옥이 간단한 손질로 변신한 것인데요.
1인 가구 독신자들에게도, 집주인에게도 모두 이득이 되는 주거형태입니다.
<인터뷰> 박형수(‘W’하우스 운영개발 팀장) : “1인 가구에서 주지 못하는 같이 사는 즐거움. 그리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할 있어서 집주인이나 세입자에게 둘 다 좋은 혜택들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 주거 문제의 대안으로 떠오르며 개성 만점의 공간까지 연출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주택들.
일상을 가꾸고 사람들과 어울려 소통하는 문화도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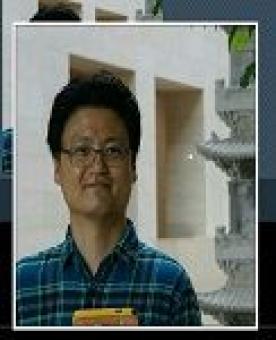
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노태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뉴스 따라잡기] 대구 실종 여대생 숨진 채 발견…“성폭행 흔적”](https://news.kbs.co.kr/data/news/2013/05/28/2665818_12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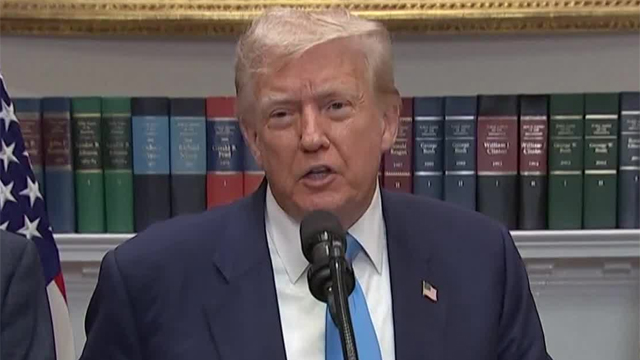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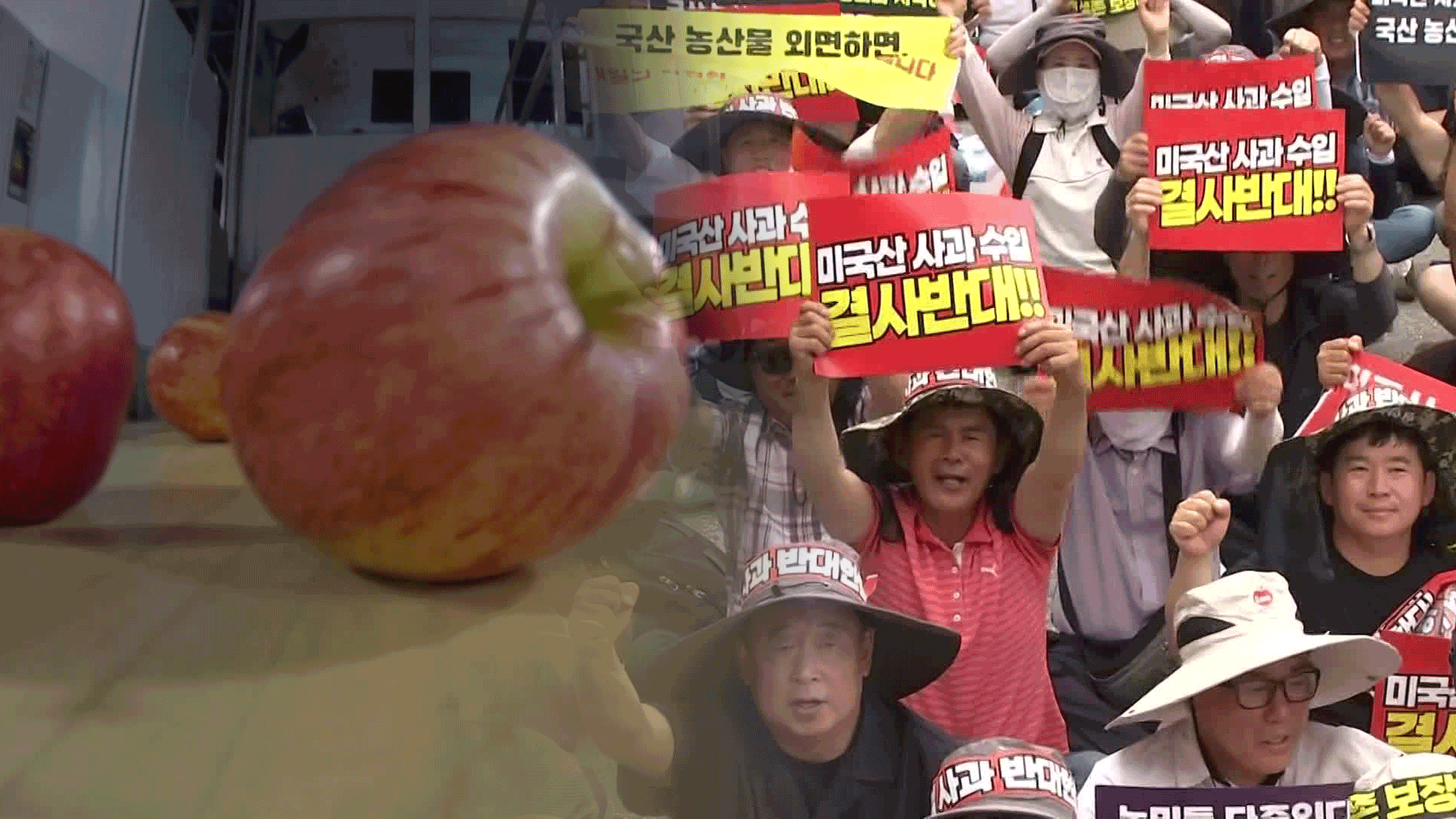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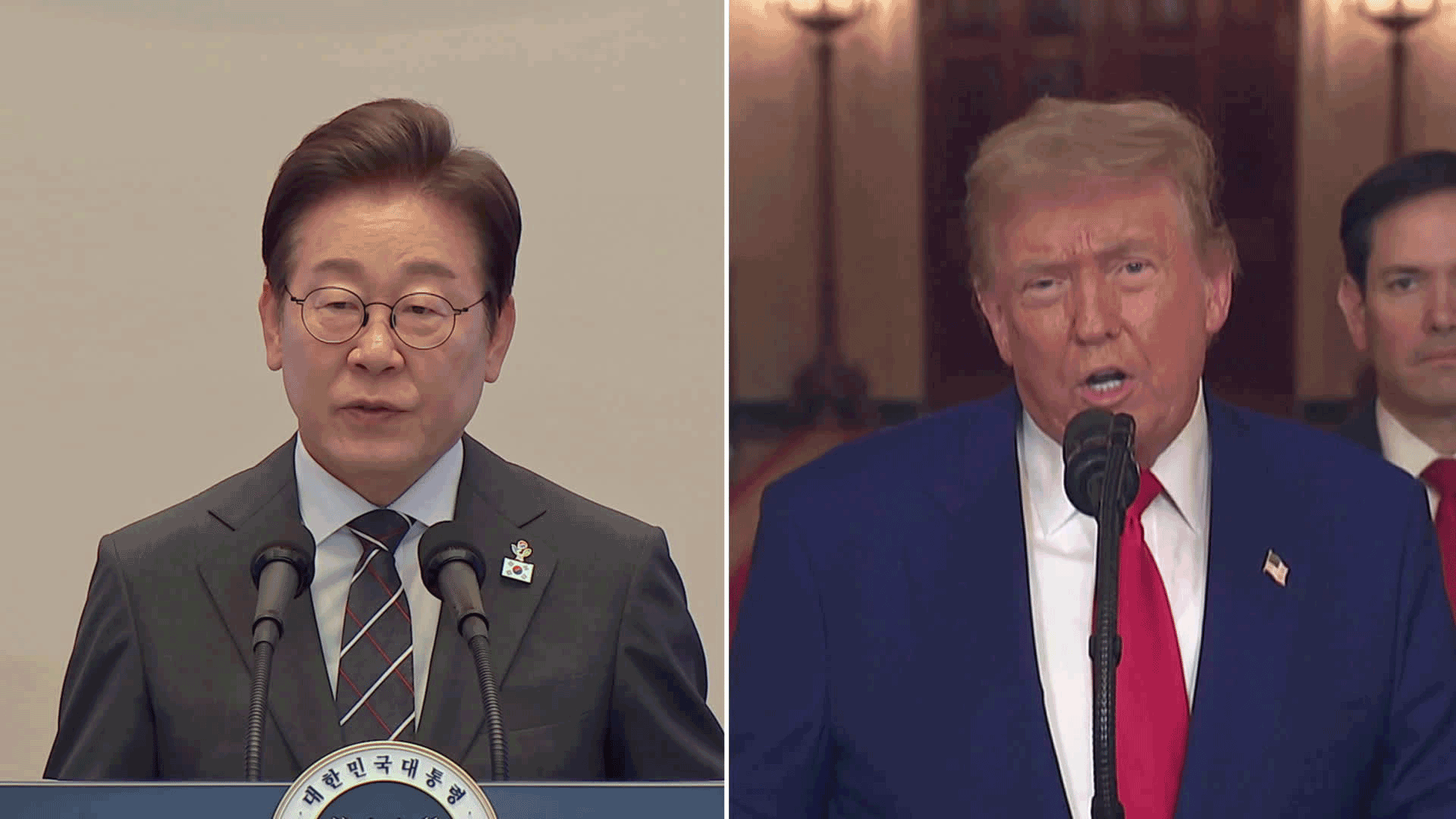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