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자가 간다] 위험한 아르바이트 현장의 청년들 ④ 공정률에 쫓기는 조선소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험한 아르바이트 현장의 청년들 ④ 공정률에 쫓기는 조선소]
전문대학교 자동차학과에 다니다 군 복무를 마친 고 모(22) 씨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지난 8월 말부터 지방의 S조선소에서 일하고 있다. 기능공의 업무를 보조하는 ‘조공’인 고 씨는 하루 일당 8만 원, 한 달이면 약 180만 원의 보수를 받는다. 전문 기술이 없는 고 씨에게 적지 않은 수입이지만 대신 현장에서 ‘살 떨리는’ 긴장을 감내해야 한다.
“(건조 중인 배에서) 바다 쪽으로 돌출한 4,5층 건물 높이의 장비에 올라가 핸드레일(난간) 설치하는 일을 했는데, 밑으로 바닷물이 출렁이고 있어서 용접하는 동안 무서웠어요. 안전장비는 착용하고 있었지만 무척 불안했죠.”
.jpg)
▲ 완공 기일에 쫓기며 배를 만들고 있는 조선소 노동자들. 불안정한 발판 위로 무거운 자재를 옮기고 용접 등 화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 위험에 노출된다.
기술이 없는 보조역이다 보니 고 씨에게는 무거운 자재를 옮기는 것 등 허드렛일이 많이 주어진다. 아직 배 만드는 현장이 익숙하지 않은데 급하게 움직여야 하다 보니 그만큼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얼마 전에는 작업 현장을 지나가는데 위쪽에서 무거운 공구가 떨어졌다. 조금만 빨리 지나갔다면 맞아서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종종 사고가 일어나는데, 얼마 전에는 파이프를 자르는 그라인더를 잘못 작동시켜 작업자가 다리를 다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언제 어디서 다칠 줄 모르니 곳곳이 위험하죠. 특히 무거운 장비를 들고 높은 곳을 오르내릴 때가 많은데 (위태로워서) 다리가 후들거리기도 하고요.”
‘언제 어떻게 다칠지 모른다’ 긴장의 연속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D조선소에서 일하고 있는 대학 휴학생 김 모(24) 씨에게도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다.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그의 하루는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된다. 4명이 한 방을 쓰기 때문에 욕실을 빨리 쓰고 출근 준비를 하는 게 습관이 됐다. 오전 6시에 통근버스를 타고 작업 현장으로 가면 아침 식사 후 간단한 체조를 하는데 막내인 김 씨는 이 시간에 먼저 현장을 정리하기 위해 바삐 움직여야 한다. 아침 8시 작업이 시작되면 김 씨는 ‘위험한 곳이니 눈치껏 잘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다고 말했다.
.jpg)
▲ 좁은 철판을 이어붙여 만든 족장. 연결부분이 풀리는 등의 사고로 부상자가 생기거나 추락사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가 하는 일은 설계도면에 맞게 설비와 자재를 맞추는 ‘취부’ 작업이다. 바닥에서 2.4~3m 높이에 설치된 족장(철판을 고정시켜 만든 발판) 위를 걸어 다니며 파이프 등을 용접할 수 있도록 맞춘다. 안전벨트와 안전모를 착용하긴 하지만 은색 쇠판으로 된 족장의 철사 고정물이 풀리는 등의 사고로 작업자가 다치거나 추락사하는 사고가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 한 사람의 실수로 동료들이 함께 다치는 경우도 있다.
“매주 월요일마다 안전 교육과 조회를 하는데 항상 2~3명의 부상자가 있더라고요.”
계약 기일에 쫓기는 건조 현장... “머리 위에서 불꽃 튀어도 참아야”
현장의 위험성은 공정률을 맞추기 위해 관리자들이 작업을 재촉하기 때문에 더욱 높아진다. 계약된 기간 안에 배를 건조해야 하는데, 작업 도중 설계를 수정하는 일도 많기 때문에 늘 공정률에 쫓긴다고 한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자신이 일하고 있는데 머리 위에서 용접작업으로 불꽃이 튀어도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한다.
건조 중인 배의 미끄러운 철판 바닥에는 장비와 조명을 연결한 전기선과 가배관 수십 개가 깔려있다. 깔끔하게 정리돼있지 않으면 넘어지기 십상인데, 철판이라 살짝만 부딪쳐도 타박상을 입는다. 김 씨와 함께 숙소 생활을 하는 문 모(24) 씨는 지난 8월 그리 높지 않은 위치에서 떨어졌는데도 갈비뼈를 다쳤다. 하지만 작업량이 많아 하루만 쉬고 다시 출근해야 했다.
.jpg)
▲ 전선과 배관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장에서 배를 만드는 노동자들. 자칫 부주의하면 안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jpg)
▲ 얼기설기 철판을 이어붙여 만든 작업통로. 급히 이동하다가 넘어지고 다치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D조선소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고 있는 김 씨와 동료들은 아파도 조퇴나 병가 내기를 꺼린다. 대부분 D조선소에서 정규직 공고가 나면 지원하려고 하는데,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동안 조퇴, 결근 등의 기록이 있으면 채용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공정률을 맞추기 위해 밤 12시까지 잔업을 하는 날이 1주일에 4일 정도이고, 특히 이번 달은 하루도 빠짐없이 자정까지 일했다고 한다. 김씨는 “기숙사로 돌아오면 쓰러져 잠들기 바쁜데, 다음날 새벽 5시30분에 또 일어나야 하는 게 너무 괴롭다”고 말했다. (계속)
<청년 기자 김태준 박다영 박세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년 기자가 간다] 위험한 아르바이트 현장의 청년들 ④ 공정률에 쫓기는 조선소
-
- 입력 2013-10-28 10:48:23
- 수정2013-11-05 14:33:56
[위험한 아르바이트 현장의 청년들 ④ 공정률에 쫓기는 조선소]
전문대학교 자동차학과에 다니다 군 복무를 마친 고 모(22) 씨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지난 8월 말부터 지방의 S조선소에서 일하고 있다. 기능공의 업무를 보조하는 ‘조공’인 고 씨는 하루 일당 8만 원, 한 달이면 약 180만 원의 보수를 받는다. 전문 기술이 없는 고 씨에게 적지 않은 수입이지만 대신 현장에서 ‘살 떨리는’ 긴장을 감내해야 한다.
“(건조 중인 배에서) 바다 쪽으로 돌출한 4,5층 건물 높이의 장비에 올라가 핸드레일(난간) 설치하는 일을 했는데, 밑으로 바닷물이 출렁이고 있어서 용접하는 동안 무서웠어요. 안전장비는 착용하고 있었지만 무척 불안했죠.”
.jpg)
▲ 완공 기일에 쫓기며 배를 만들고 있는 조선소 노동자들. 불안정한 발판 위로 무거운 자재를 옮기고 용접 등 화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 위험에 노출된다.
기술이 없는 보조역이다 보니 고 씨에게는 무거운 자재를 옮기는 것 등 허드렛일이 많이 주어진다. 아직 배 만드는 현장이 익숙하지 않은데 급하게 움직여야 하다 보니 그만큼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얼마 전에는 작업 현장을 지나가는데 위쪽에서 무거운 공구가 떨어졌다. 조금만 빨리 지나갔다면 맞아서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종종 사고가 일어나는데, 얼마 전에는 파이프를 자르는 그라인더를 잘못 작동시켜 작업자가 다리를 다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언제 어디서 다칠 줄 모르니 곳곳이 위험하죠. 특히 무거운 장비를 들고 높은 곳을 오르내릴 때가 많은데 (위태로워서) 다리가 후들거리기도 하고요.”
‘언제 어떻게 다칠지 모른다’ 긴장의 연속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D조선소에서 일하고 있는 대학 휴학생 김 모(24) 씨에게도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다.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그의 하루는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된다. 4명이 한 방을 쓰기 때문에 욕실을 빨리 쓰고 출근 준비를 하는 게 습관이 됐다. 오전 6시에 통근버스를 타고 작업 현장으로 가면 아침 식사 후 간단한 체조를 하는데 막내인 김 씨는 이 시간에 먼저 현장을 정리하기 위해 바삐 움직여야 한다. 아침 8시 작업이 시작되면 김 씨는 ‘위험한 곳이니 눈치껏 잘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다고 말했다.
.jpg)
▲ 좁은 철판을 이어붙여 만든 족장. 연결부분이 풀리는 등의 사고로 부상자가 생기거나 추락사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가 하는 일은 설계도면에 맞게 설비와 자재를 맞추는 ‘취부’ 작업이다. 바닥에서 2.4~3m 높이에 설치된 족장(철판을 고정시켜 만든 발판) 위를 걸어 다니며 파이프 등을 용접할 수 있도록 맞춘다. 안전벨트와 안전모를 착용하긴 하지만 은색 쇠판으로 된 족장의 철사 고정물이 풀리는 등의 사고로 작업자가 다치거나 추락사하는 사고가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 한 사람의 실수로 동료들이 함께 다치는 경우도 있다.
“매주 월요일마다 안전 교육과 조회를 하는데 항상 2~3명의 부상자가 있더라고요.”
계약 기일에 쫓기는 건조 현장... “머리 위에서 불꽃 튀어도 참아야”
현장의 위험성은 공정률을 맞추기 위해 관리자들이 작업을 재촉하기 때문에 더욱 높아진다. 계약된 기간 안에 배를 건조해야 하는데, 작업 도중 설계를 수정하는 일도 많기 때문에 늘 공정률에 쫓긴다고 한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자신이 일하고 있는데 머리 위에서 용접작업으로 불꽃이 튀어도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한다.
건조 중인 배의 미끄러운 철판 바닥에는 장비와 조명을 연결한 전기선과 가배관 수십 개가 깔려있다. 깔끔하게 정리돼있지 않으면 넘어지기 십상인데, 철판이라 살짝만 부딪쳐도 타박상을 입는다. 김 씨와 함께 숙소 생활을 하는 문 모(24) 씨는 지난 8월 그리 높지 않은 위치에서 떨어졌는데도 갈비뼈를 다쳤다. 하지만 작업량이 많아 하루만 쉬고 다시 출근해야 했다..jpg)
▲ 전선과 배관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장에서 배를 만드는 노동자들. 자칫 부주의하면 안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jpg)
▲ 얼기설기 철판을 이어붙여 만든 작업통로. 급히 이동하다가 넘어지고 다치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D조선소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고 있는 김 씨와 동료들은 아파도 조퇴나 병가 내기를 꺼린다. 대부분 D조선소에서 정규직 공고가 나면 지원하려고 하는데,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동안 조퇴, 결근 등의 기록이 있으면 채용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공정률을 맞추기 위해 밤 12시까지 잔업을 하는 날이 1주일에 4일 정도이고, 특히 이번 달은 하루도 빠짐없이 자정까지 일했다고 한다. 김씨는 “기숙사로 돌아오면 쓰러져 잠들기 바쁜데, 다음날 새벽 5시30분에 또 일어나야 하는 게 너무 괴롭다”고 말했다. (계속)
<청년 기자 김태준 박다영 박세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단독] 김민석 총리, 취임 첫 일정으로 ‘송미령 반대’ <br>농민단체 농성장 방문](/data/news/2025/07/03/20250703_YUTdgQ.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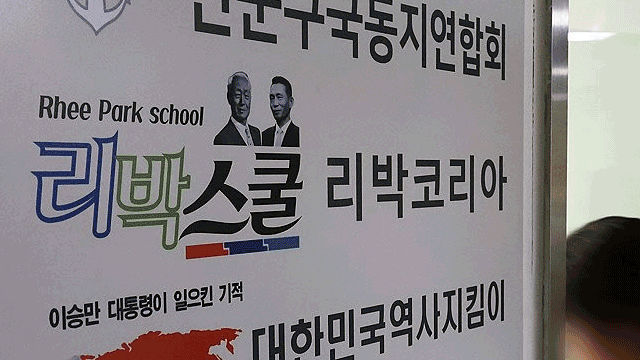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