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日 집단적 자위권 제한 허용
입력 2013.10.28 (23:52)
수정 2013.10.29 (20: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는 이 시점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동북아 역사재단 이명찬 연구위원과 알아봅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앵커 : "먼저 집단적 자위권, 시청자 분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이명찬 : "어떤 나라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그 국가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그 국가를 도와줄 수 있는 권리를 집단 자위권이라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골목길을 가다가 누군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강도를 만난 사람과 가까운 주변 친구들이 옆에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죠."
남앵커 :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무력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명찬 : "그렇죠. 무력도 쓸 수 있다는 거죠."
남앵커 : "자, 그러면 일본이죠. 평화헌법 9조를 보면 일본은 국제 분쟁에 무력을 사용할 수 없다고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명찬 : "사실 일본 헌법 9조를 보면 자위대 전제를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둘 수 없다. 그러니까 국제분쟁 해결 수단이 아니면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자위대를 정당화해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되면 자위대가 해외에 나가서 국제 분쟁을 해결 하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남앵커 : "무력을 써서 말이죠."
이명찬 : "네 무력을 써서.."
남앵커 : "그것이 아베정권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명찬 : "그렇죠. 과거에도 우익정권이 정권을 잡았을 때, 총리가 되었을 때도 예를 든다면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 같은 경우 총리가 되기 전에는 헌법 개정을 강하게 강조했고, 집단자위권 행사도 가능하다고 이야기 했지만, 총리가 됐을 때는 사실상 실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베 총리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여기에는 아마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유를 이야기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국내 문제로 일본이 워낙 오랫동안 경기 침체가 되다보니까 폐쇄감을 해결하면 좋겠다. 이것과 또 하나는 주변 국가의 급상승, 특히 중국의 급부상과 한국의 국제적 신분이 상승되고 상대적으로 어떤 위화감 같은 것을 많이 느꼈다고 봅니다."
남앵커 : "그렇다고 보면 우리 정부가 이 시점에서 조건부 용인을 했다는 것,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이명찬 : "한국 정부로서는 예를 들어서 한반도 유사시에 주한 미군만 가지고 사실상 힘에 부칠 경우 주일미군이 아마 와서 도와줄 것입니다. 그럴 경우 주일미군이 한반도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 집단 자위대가 후방 지원을 하게 됩니다."
남앵커 : "병참 역할을 하는 것이군요."
이명찬 : "집단 자위권 행사에 해당 되니까 그 부분이 한국으로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죠. 반면에 한반도의 위기를 기회삼아서 자위대가 한국까지 진출해서 군사작전을 펴는 여기에 대한 위기가 굉장히 강한 거죠."
이명찬 : "그러면 미국이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한 이유, 배경, 이것이 궁금한데요. 사실 바란 거 아니겠습니까."
이명찬 : "미국은 냉전이 끝나고 울프전쟁 이후부터 쭉 일본에게 집단자위권을 행사해 주기를 바랐었죠. 왜냐하면 미국이 냉전을 치르면서 국력이 많이 쇄했고, 최근에도 이라크전쟁을 치르면서 국력이 많이 쇄했죠. 그 부분을 일본 동맹국가가 채워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꾸준히 요구해왔는데 기존의 일본 총리들은 일본 국내 여론의 반대를 핑계로 안했었죠. 아베총리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강하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런 형국이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환영하는 거죠."
남앵커 :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와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이것이 지금 현재 중국을 자극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명찬 : "그렇죠. 가장 큰 일본의 문제가 중국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과거에는 미국이 슈퍼 파워로서 혼자서도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 본다면 최근에 미국의 힘이 많이 쇄하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이 급부상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힘이 강해지니까 일본의 힘을 빌려서 중국을 견제해보고 싶다.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남앵커 :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이명찬 : "사실 한국은 미국도 중요하죠. 일본도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옛날 친구죠. 새로운 친구인 중국과의 관계도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잘 아울러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단독으로 대응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유럽의 나토와 같은 다자간 안보 틀 같은 것을 만드는데 한국이 주도적으로 하면서 일본의 자위대가 집단 행사를 하더라도 나토와 같은 틀 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남앵커 : "독일이 나토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것 처럼요."
이명찬 :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 정부로서는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자간 안보 틀을 만드는 것에 우리가 주력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남앵커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명찬 : "감사합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는 이 시점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동북아 역사재단 이명찬 연구위원과 알아봅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앵커 : "먼저 집단적 자위권, 시청자 분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이명찬 : "어떤 나라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그 국가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그 국가를 도와줄 수 있는 권리를 집단 자위권이라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골목길을 가다가 누군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강도를 만난 사람과 가까운 주변 친구들이 옆에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죠."
남앵커 :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무력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명찬 : "그렇죠. 무력도 쓸 수 있다는 거죠."
남앵커 : "자, 그러면 일본이죠. 평화헌법 9조를 보면 일본은 국제 분쟁에 무력을 사용할 수 없다고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명찬 : "사실 일본 헌법 9조를 보면 자위대 전제를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둘 수 없다. 그러니까 국제분쟁 해결 수단이 아니면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자위대를 정당화해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되면 자위대가 해외에 나가서 국제 분쟁을 해결 하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남앵커 : "무력을 써서 말이죠."
이명찬 : "네 무력을 써서.."
남앵커 : "그것이 아베정권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명찬 : "그렇죠. 과거에도 우익정권이 정권을 잡았을 때, 총리가 되었을 때도 예를 든다면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 같은 경우 총리가 되기 전에는 헌법 개정을 강하게 강조했고, 집단자위권 행사도 가능하다고 이야기 했지만, 총리가 됐을 때는 사실상 실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베 총리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여기에는 아마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유를 이야기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국내 문제로 일본이 워낙 오랫동안 경기 침체가 되다보니까 폐쇄감을 해결하면 좋겠다. 이것과 또 하나는 주변 국가의 급상승, 특히 중국의 급부상과 한국의 국제적 신분이 상승되고 상대적으로 어떤 위화감 같은 것을 많이 느꼈다고 봅니다."
남앵커 : "그렇다고 보면 우리 정부가 이 시점에서 조건부 용인을 했다는 것,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이명찬 : "한국 정부로서는 예를 들어서 한반도 유사시에 주한 미군만 가지고 사실상 힘에 부칠 경우 주일미군이 아마 와서 도와줄 것입니다. 그럴 경우 주일미군이 한반도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 집단 자위대가 후방 지원을 하게 됩니다."
남앵커 : "병참 역할을 하는 것이군요."
이명찬 : "집단 자위권 행사에 해당 되니까 그 부분이 한국으로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죠. 반면에 한반도의 위기를 기회삼아서 자위대가 한국까지 진출해서 군사작전을 펴는 여기에 대한 위기가 굉장히 강한 거죠."
이명찬 : "그러면 미국이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한 이유, 배경, 이것이 궁금한데요. 사실 바란 거 아니겠습니까."
이명찬 : "미국은 냉전이 끝나고 울프전쟁 이후부터 쭉 일본에게 집단자위권을 행사해 주기를 바랐었죠. 왜냐하면 미국이 냉전을 치르면서 국력이 많이 쇄했고, 최근에도 이라크전쟁을 치르면서 국력이 많이 쇄했죠. 그 부분을 일본 동맹국가가 채워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꾸준히 요구해왔는데 기존의 일본 총리들은 일본 국내 여론의 반대를 핑계로 안했었죠. 아베총리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강하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런 형국이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환영하는 거죠."
남앵커 :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와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이것이 지금 현재 중국을 자극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명찬 : "그렇죠. 가장 큰 일본의 문제가 중국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과거에는 미국이 슈퍼 파워로서 혼자서도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 본다면 최근에 미국의 힘이 많이 쇄하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이 급부상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힘이 강해지니까 일본의 힘을 빌려서 중국을 견제해보고 싶다.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남앵커 :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이명찬 : "사실 한국은 미국도 중요하죠. 일본도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옛날 친구죠. 새로운 친구인 중국과의 관계도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잘 아울러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단독으로 대응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유럽의 나토와 같은 다자간 안보 틀 같은 것을 만드는데 한국이 주도적으로 하면서 일본의 자위대가 집단 행사를 하더라도 나토와 같은 틀 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남앵커 : "독일이 나토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것 처럼요."
이명찬 :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 정부로서는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자간 안보 틀을 만드는 것에 우리가 주력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남앵커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명찬 : "감사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슈&토크] 日 집단적 자위권 제한 허용
-
- 입력 2013-10-29 07:13:07
- 수정2013-10-29 20:29:34

<앵커 멘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는 이 시점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동북아 역사재단 이명찬 연구위원과 알아봅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앵커 : "먼저 집단적 자위권, 시청자 분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이명찬 : "어떤 나라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그 국가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그 국가를 도와줄 수 있는 권리를 집단 자위권이라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골목길을 가다가 누군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강도를 만난 사람과 가까운 주변 친구들이 옆에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죠."
남앵커 :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무력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명찬 : "그렇죠. 무력도 쓸 수 있다는 거죠."
남앵커 : "자, 그러면 일본이죠. 평화헌법 9조를 보면 일본은 국제 분쟁에 무력을 사용할 수 없다고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명찬 : "사실 일본 헌법 9조를 보면 자위대 전제를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둘 수 없다. 그러니까 국제분쟁 해결 수단이 아니면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자위대를 정당화해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되면 자위대가 해외에 나가서 국제 분쟁을 해결 하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남앵커 : "무력을 써서 말이죠."
이명찬 : "네 무력을 써서.."
남앵커 : "그것이 아베정권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명찬 : "그렇죠. 과거에도 우익정권이 정권을 잡았을 때, 총리가 되었을 때도 예를 든다면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 같은 경우 총리가 되기 전에는 헌법 개정을 강하게 강조했고, 집단자위권 행사도 가능하다고 이야기 했지만, 총리가 됐을 때는 사실상 실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베 총리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여기에는 아마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유를 이야기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국내 문제로 일본이 워낙 오랫동안 경기 침체가 되다보니까 폐쇄감을 해결하면 좋겠다. 이것과 또 하나는 주변 국가의 급상승, 특히 중국의 급부상과 한국의 국제적 신분이 상승되고 상대적으로 어떤 위화감 같은 것을 많이 느꼈다고 봅니다."
남앵커 : "그렇다고 보면 우리 정부가 이 시점에서 조건부 용인을 했다는 것,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이명찬 : "한국 정부로서는 예를 들어서 한반도 유사시에 주한 미군만 가지고 사실상 힘에 부칠 경우 주일미군이 아마 와서 도와줄 것입니다. 그럴 경우 주일미군이 한반도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 집단 자위대가 후방 지원을 하게 됩니다."
남앵커 : "병참 역할을 하는 것이군요."
이명찬 : "집단 자위권 행사에 해당 되니까 그 부분이 한국으로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죠. 반면에 한반도의 위기를 기회삼아서 자위대가 한국까지 진출해서 군사작전을 펴는 여기에 대한 위기가 굉장히 강한 거죠."
이명찬 : "그러면 미국이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한 이유, 배경, 이것이 궁금한데요. 사실 바란 거 아니겠습니까."
이명찬 : "미국은 냉전이 끝나고 울프전쟁 이후부터 쭉 일본에게 집단자위권을 행사해 주기를 바랐었죠. 왜냐하면 미국이 냉전을 치르면서 국력이 많이 쇄했고, 최근에도 이라크전쟁을 치르면서 국력이 많이 쇄했죠. 그 부분을 일본 동맹국가가 채워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꾸준히 요구해왔는데 기존의 일본 총리들은 일본 국내 여론의 반대를 핑계로 안했었죠. 아베총리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강하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런 형국이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환영하는 거죠."
남앵커 :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와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이것이 지금 현재 중국을 자극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명찬 : "그렇죠. 가장 큰 일본의 문제가 중국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과거에는 미국이 슈퍼 파워로서 혼자서도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 본다면 최근에 미국의 힘이 많이 쇄하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이 급부상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힘이 강해지니까 일본의 힘을 빌려서 중국을 견제해보고 싶다.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남앵커 :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이명찬 : "사실 한국은 미국도 중요하죠. 일본도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옛날 친구죠. 새로운 친구인 중국과의 관계도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잘 아울러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단독으로 대응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유럽의 나토와 같은 다자간 안보 틀 같은 것을 만드는데 한국이 주도적으로 하면서 일본의 자위대가 집단 행사를 하더라도 나토와 같은 틀 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남앵커 : "독일이 나토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것 처럼요."
이명찬 :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 정부로서는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자간 안보 틀을 만드는 것에 우리가 주력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남앵커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명찬 : "감사합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는 이 시점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동북아 역사재단 이명찬 연구위원과 알아봅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앵커 : "먼저 집단적 자위권, 시청자 분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이명찬 : "어떤 나라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그 국가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그 국가를 도와줄 수 있는 권리를 집단 자위권이라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골목길을 가다가 누군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강도를 만난 사람과 가까운 주변 친구들이 옆에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죠."
남앵커 :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무력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명찬 : "그렇죠. 무력도 쓸 수 있다는 거죠."
남앵커 : "자, 그러면 일본이죠. 평화헌법 9조를 보면 일본은 국제 분쟁에 무력을 사용할 수 없다고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명찬 : "사실 일본 헌법 9조를 보면 자위대 전제를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둘 수 없다. 그러니까 국제분쟁 해결 수단이 아니면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자위대를 정당화해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되면 자위대가 해외에 나가서 국제 분쟁을 해결 하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남앵커 : "무력을 써서 말이죠."
이명찬 : "네 무력을 써서.."
남앵커 : "그것이 아베정권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명찬 : "그렇죠. 과거에도 우익정권이 정권을 잡았을 때, 총리가 되었을 때도 예를 든다면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 같은 경우 총리가 되기 전에는 헌법 개정을 강하게 강조했고, 집단자위권 행사도 가능하다고 이야기 했지만, 총리가 됐을 때는 사실상 실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베 총리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여기에는 아마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유를 이야기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국내 문제로 일본이 워낙 오랫동안 경기 침체가 되다보니까 폐쇄감을 해결하면 좋겠다. 이것과 또 하나는 주변 국가의 급상승, 특히 중국의 급부상과 한국의 국제적 신분이 상승되고 상대적으로 어떤 위화감 같은 것을 많이 느꼈다고 봅니다."
남앵커 : "그렇다고 보면 우리 정부가 이 시점에서 조건부 용인을 했다는 것,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이명찬 : "한국 정부로서는 예를 들어서 한반도 유사시에 주한 미군만 가지고 사실상 힘에 부칠 경우 주일미군이 아마 와서 도와줄 것입니다. 그럴 경우 주일미군이 한반도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 집단 자위대가 후방 지원을 하게 됩니다."
남앵커 : "병참 역할을 하는 것이군요."
이명찬 : "집단 자위권 행사에 해당 되니까 그 부분이 한국으로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죠. 반면에 한반도의 위기를 기회삼아서 자위대가 한국까지 진출해서 군사작전을 펴는 여기에 대한 위기가 굉장히 강한 거죠."
이명찬 : "그러면 미국이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한 이유, 배경, 이것이 궁금한데요. 사실 바란 거 아니겠습니까."
이명찬 : "미국은 냉전이 끝나고 울프전쟁 이후부터 쭉 일본에게 집단자위권을 행사해 주기를 바랐었죠. 왜냐하면 미국이 냉전을 치르면서 국력이 많이 쇄했고, 최근에도 이라크전쟁을 치르면서 국력이 많이 쇄했죠. 그 부분을 일본 동맹국가가 채워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꾸준히 요구해왔는데 기존의 일본 총리들은 일본 국내 여론의 반대를 핑계로 안했었죠. 아베총리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강하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런 형국이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환영하는 거죠."
남앵커 :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와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이것이 지금 현재 중국을 자극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명찬 : "그렇죠. 가장 큰 일본의 문제가 중국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과거에는 미국이 슈퍼 파워로서 혼자서도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 본다면 최근에 미국의 힘이 많이 쇄하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이 급부상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힘이 강해지니까 일본의 힘을 빌려서 중국을 견제해보고 싶다.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남앵커 :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이명찬 : "사실 한국은 미국도 중요하죠. 일본도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옛날 친구죠. 새로운 친구인 중국과의 관계도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잘 아울러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단독으로 대응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유럽의 나토와 같은 다자간 안보 틀 같은 것을 만드는데 한국이 주도적으로 하면서 일본의 자위대가 집단 행사를 하더라도 나토와 같은 틀 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남앵커 : "독일이 나토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것 처럼요."
이명찬 :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 정부로서는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자간 안보 틀을 만드는 것에 우리가 주력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남앵커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명찬 : "감사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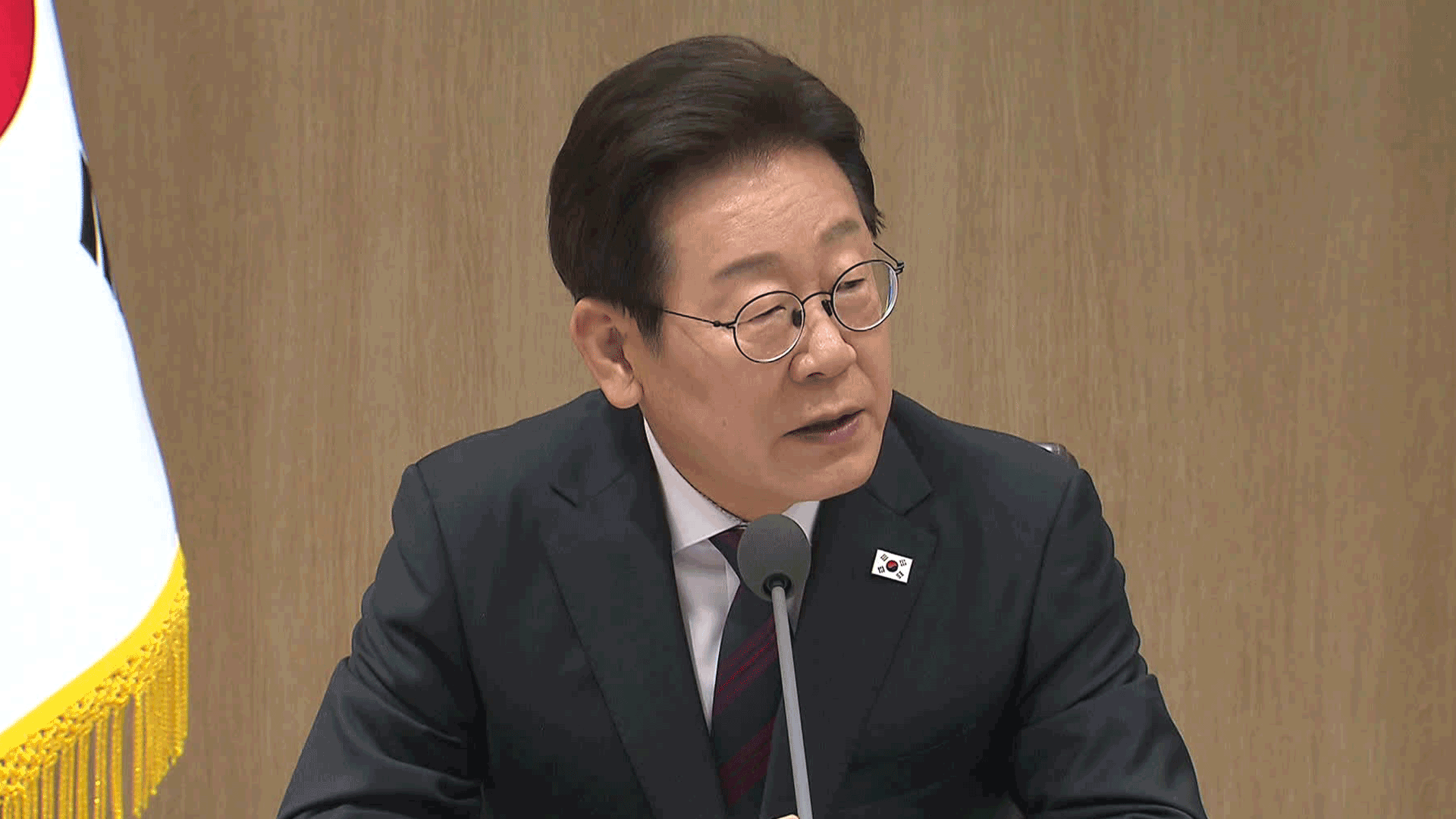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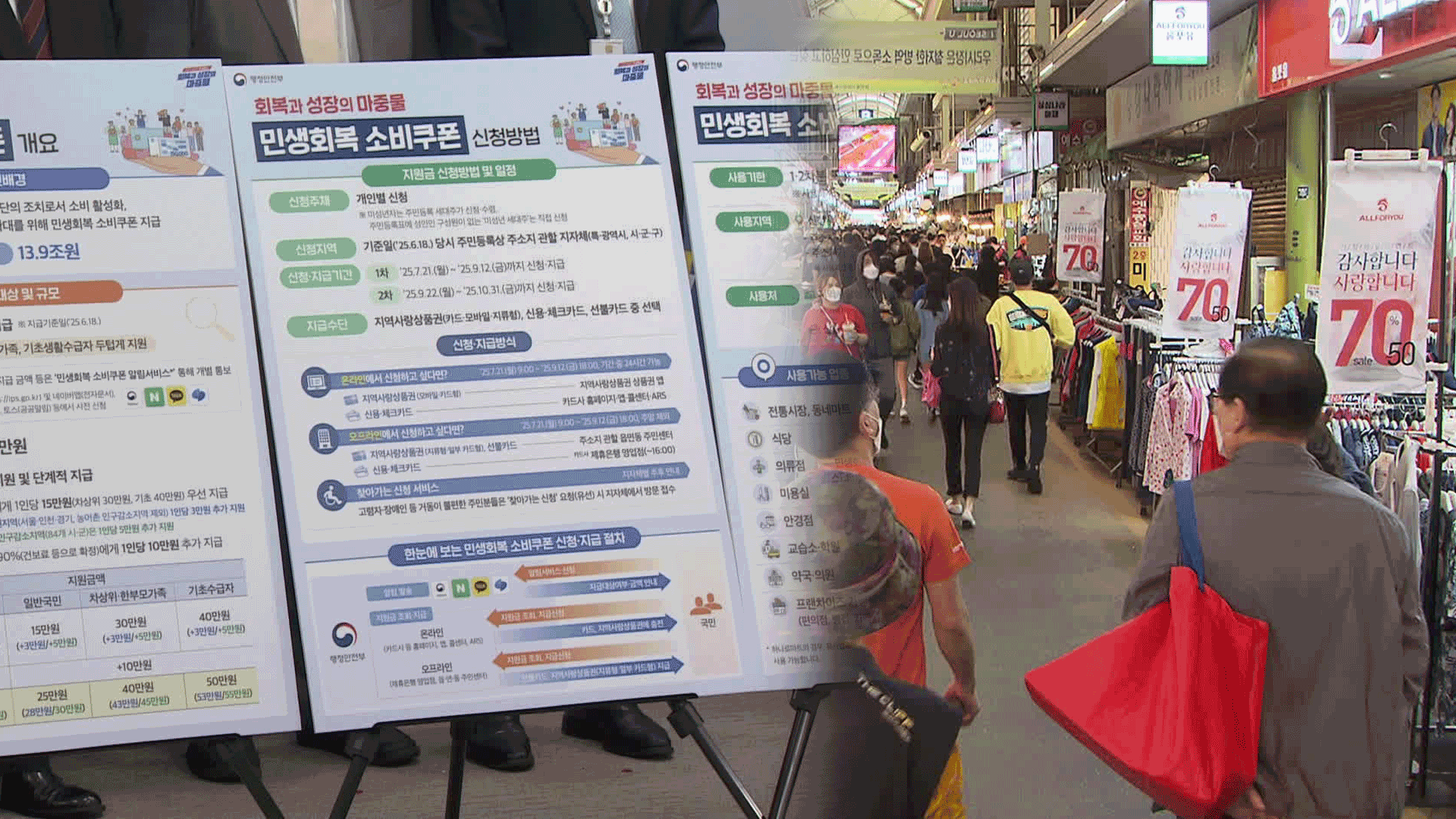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