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정세는?
입력 2013.12.23 (23:51)
수정 2013.12.24 (20: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북한에서 천재 피아니스트로 이름을 알렸던 청년이 북한을 떠나 지금 한국에서 못 다 이룬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철웅 서울교대 연구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앵커 : "북한에서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피아노를 배우게 됐고 전공까지 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김철웅 : "일단은 부모님 욕심이 좀 들어 간 것 같고요. 북한에서는 1958년에 국회를 통과해서 예체능 분야 조기교육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8살 때부터 평양음악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남앵커 : "어렸을 때부터 충분히 피아노를 배울만한 환경이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김철웅 : "네, 아버님이 고위공직자셨고 어머니는 대학교 교수셨습니다."
남앵커 : "그러셨군요. 탈북 이유가 음악적 자유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탈북을 언제 하셨죠?"
김철웅 : "2002년 12월에 했거든요. 제가 탈북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북한에서 금지곡으로 되어 있던 북한에서 금지곡이라고 하게 되면 한국에서 대중음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곡들이 자본주의가 만든 문화라고 해서 연주를 하면 안 되는데요. 그런 곡을 유학하면서 듣게 되었고 그 곡을 제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들려주려고 연주했다가.."
남앵커 : "어디서 연주 하신 거예요?"
김철웅 : "연습실에서요. 연습실에서 연습을 했었는데 누가 신고를 해서 문제가 됐어요. 보안부에 가서 시말서를 쓰게 되면서.."
남앵커 : "그 사랑하는 분이 대단하신 분인가요."
김철웅 : "항간의 이슈죠. 장성택씨의 조카딸이었습니다."
남앵커 : "조카딸을 아실 정도면 최상위층 생활에 대해서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장성택 처형이 굉장히 큰 이슈인데 처형 관련된 소식이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김철웅 : "상당히 충격적일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설마 장성택이. 그 사람은 1980년대부터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라서 설마 장성택을 칠 것이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그로 인하여 북한 내부에서 특히 고위층에는 공포 분위기가 돌지 않을까, 제 2의 장성택은 누가 될까. 여러 가지 공포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남앵커 : "장성택 직접 보셨죠?"
김철웅 : "그럼요."
남앵커 : "어떤 분이셨는지요."
김철웅 : "상당히 카리스마 있고 두 번째는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카리스마 속에 리더십이 있는 남성스러움.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의 존경을 무척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남앵커 : "그렇군요. 북한에서 장성택 처형보도가 나왔고 우리나라 남한에서도 처형보도가 나왔는데 양쪽 비교해보니까 어떠셨습니까."
김철웅 : "장성택을 처형하는 장면을 내 보낸 것은 제가 북한에 태어났지만 처음 보는 상황이고요. 북한에서도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내외 효과를 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 해 보고요. 한국에서 처형소식을 내 보내는 것을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꾸 한국 시각으로 보지 말고 북한 시간으로 해법을 찾아보면 좀 더 명확한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북한 눈을 가지고 북한식 해법을 찾아봐야 하는데 한국식 눈을 가지고 북한을 바라보려고 하더라는거죠."
남앵커 : "북한식 해법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김철웅 : "그 사회에 대한 문화적인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왜 이런 것이 나왔는지 훨씬 더 알기 쉬울 텐데, 한국식 눈을 가지고 북한을 바라보다보니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지 않았습니까."
남앵커 : "그 설왕설래 가운데 하나도 리설주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리설주라는 사람은 같이 예술 하는 분, 음악하신 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잘 알려진 분인지요?"
김철웅 : "평범했던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평범했던 사람인데 발탁이 되어서 김정은의 와이프가 됐는데요. 지난번에 문경진 은하수 관현악단 처형수가 나왔는데 그들의 입에도 오를 만큼 너무 평범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리설주의 위상과 관련해서 북한에서는 특급비밀이 군사비밀이나 경제비밀보다 더 극한 비밀이 로열패밀리에 대한 자료거든요. 그런 비밀들이 문경진과 같은 악단에서 녹여지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처형을 하지 않았을까."
남앵커 :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계십니다. 북한의 음악, 남한의 음악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고 어떤 부분에 장점이 있을까요."
김철웅 :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남이 사는 나라, 남이 사는 우리나라, 남이 사는 내 나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 우리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우리 것 다운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콩쿠르에 나가면 자기나라 곡을 한 곡씩 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 곡이 좀 드물더라고요. 많이 있겠지만 알려져있지 않은 것이겠지만.."
남앵커 : "그렇다고 아리랑을 칠 수도 없고요."
김철웅 :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요. 북한의 음악을 놓고 볼 때는 북한도 상당히 클래식 부분은 세계적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노래 속에 수령에 대한 위대성, 당 정책 이런 것들이 함축되어 선전 선동 수단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죠."
남앵커 : "교수님 우리 것 꼭 찾아주시길 바라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웅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북한에서 천재 피아니스트로 이름을 알렸던 청년이 북한을 떠나 지금 한국에서 못 다 이룬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철웅 서울교대 연구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앵커 : "북한에서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피아노를 배우게 됐고 전공까지 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김철웅 : "일단은 부모님 욕심이 좀 들어 간 것 같고요. 북한에서는 1958년에 국회를 통과해서 예체능 분야 조기교육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8살 때부터 평양음악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남앵커 : "어렸을 때부터 충분히 피아노를 배울만한 환경이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김철웅 : "네, 아버님이 고위공직자셨고 어머니는 대학교 교수셨습니다."
남앵커 : "그러셨군요. 탈북 이유가 음악적 자유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탈북을 언제 하셨죠?"
김철웅 : "2002년 12월에 했거든요. 제가 탈북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북한에서 금지곡으로 되어 있던 북한에서 금지곡이라고 하게 되면 한국에서 대중음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곡들이 자본주의가 만든 문화라고 해서 연주를 하면 안 되는데요. 그런 곡을 유학하면서 듣게 되었고 그 곡을 제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들려주려고 연주했다가.."
남앵커 : "어디서 연주 하신 거예요?"
김철웅 : "연습실에서요. 연습실에서 연습을 했었는데 누가 신고를 해서 문제가 됐어요. 보안부에 가서 시말서를 쓰게 되면서.."
남앵커 : "그 사랑하는 분이 대단하신 분인가요."
김철웅 : "항간의 이슈죠. 장성택씨의 조카딸이었습니다."
남앵커 : "조카딸을 아실 정도면 최상위층 생활에 대해서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장성택 처형이 굉장히 큰 이슈인데 처형 관련된 소식이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김철웅 : "상당히 충격적일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설마 장성택이. 그 사람은 1980년대부터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라서 설마 장성택을 칠 것이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그로 인하여 북한 내부에서 특히 고위층에는 공포 분위기가 돌지 않을까, 제 2의 장성택은 누가 될까. 여러 가지 공포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남앵커 : "장성택 직접 보셨죠?"
김철웅 : "그럼요."
남앵커 : "어떤 분이셨는지요."
김철웅 : "상당히 카리스마 있고 두 번째는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카리스마 속에 리더십이 있는 남성스러움.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의 존경을 무척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남앵커 : "그렇군요. 북한에서 장성택 처형보도가 나왔고 우리나라 남한에서도 처형보도가 나왔는데 양쪽 비교해보니까 어떠셨습니까."
김철웅 : "장성택을 처형하는 장면을 내 보낸 것은 제가 북한에 태어났지만 처음 보는 상황이고요. 북한에서도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내외 효과를 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 해 보고요. 한국에서 처형소식을 내 보내는 것을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꾸 한국 시각으로 보지 말고 북한 시간으로 해법을 찾아보면 좀 더 명확한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북한 눈을 가지고 북한식 해법을 찾아봐야 하는데 한국식 눈을 가지고 북한을 바라보려고 하더라는거죠."
남앵커 : "북한식 해법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김철웅 : "그 사회에 대한 문화적인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왜 이런 것이 나왔는지 훨씬 더 알기 쉬울 텐데, 한국식 눈을 가지고 북한을 바라보다보니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지 않았습니까."
남앵커 : "그 설왕설래 가운데 하나도 리설주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리설주라는 사람은 같이 예술 하는 분, 음악하신 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잘 알려진 분인지요?"
김철웅 : "평범했던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평범했던 사람인데 발탁이 되어서 김정은의 와이프가 됐는데요. 지난번에 문경진 은하수 관현악단 처형수가 나왔는데 그들의 입에도 오를 만큼 너무 평범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리설주의 위상과 관련해서 북한에서는 특급비밀이 군사비밀이나 경제비밀보다 더 극한 비밀이 로열패밀리에 대한 자료거든요. 그런 비밀들이 문경진과 같은 악단에서 녹여지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처형을 하지 않았을까."
남앵커 :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계십니다. 북한의 음악, 남한의 음악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고 어떤 부분에 장점이 있을까요."
김철웅 :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남이 사는 나라, 남이 사는 우리나라, 남이 사는 내 나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 우리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우리 것 다운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콩쿠르에 나가면 자기나라 곡을 한 곡씩 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 곡이 좀 드물더라고요. 많이 있겠지만 알려져있지 않은 것이겠지만.."
남앵커 : "그렇다고 아리랑을 칠 수도 없고요."
김철웅 :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요. 북한의 음악을 놓고 볼 때는 북한도 상당히 클래식 부분은 세계적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노래 속에 수령에 대한 위대성, 당 정책 이런 것들이 함축되어 선전 선동 수단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죠."
남앵커 : "교수님 우리 것 꼭 찾아주시길 바라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웅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슈&토크]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정세는?
-
- 입력 2013-12-24 07:48:54
- 수정2013-12-24 20:22: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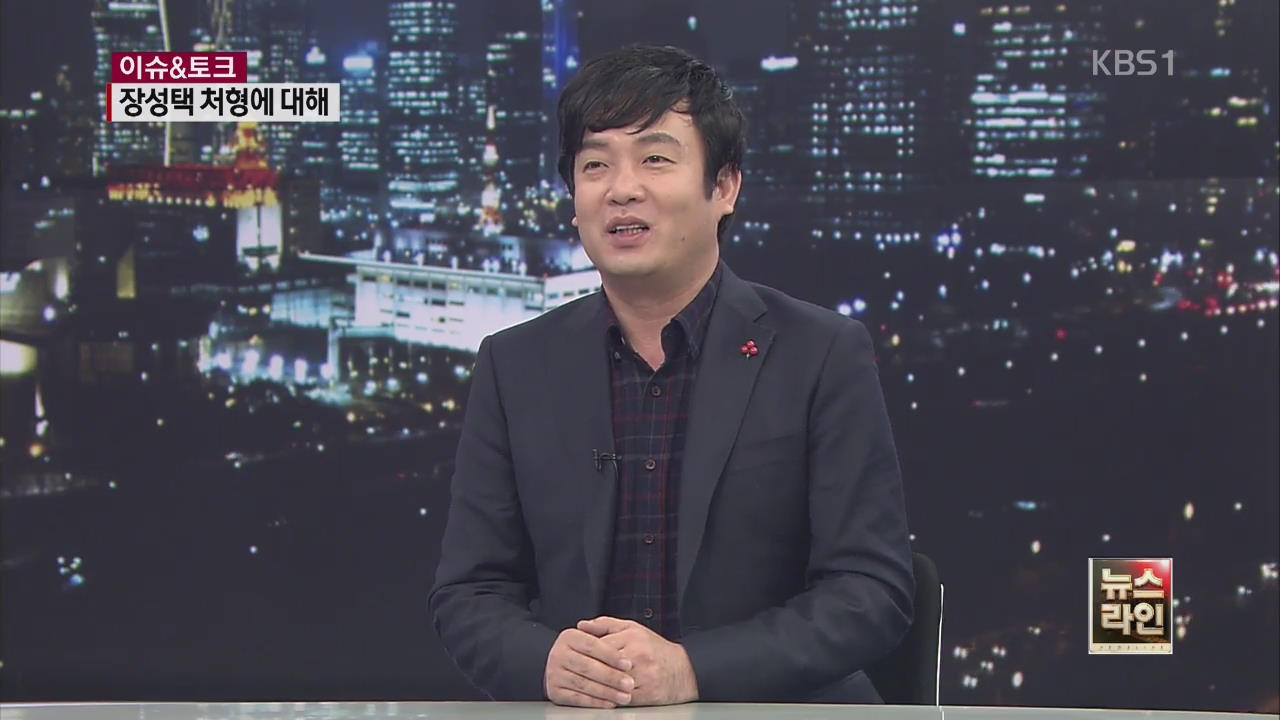
<앵커 멘트>
북한에서 천재 피아니스트로 이름을 알렸던 청년이 북한을 떠나 지금 한국에서 못 다 이룬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철웅 서울교대 연구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앵커 : "북한에서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피아노를 배우게 됐고 전공까지 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김철웅 : "일단은 부모님 욕심이 좀 들어 간 것 같고요. 북한에서는 1958년에 국회를 통과해서 예체능 분야 조기교육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8살 때부터 평양음악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남앵커 : "어렸을 때부터 충분히 피아노를 배울만한 환경이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김철웅 : "네, 아버님이 고위공직자셨고 어머니는 대학교 교수셨습니다."
남앵커 : "그러셨군요. 탈북 이유가 음악적 자유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탈북을 언제 하셨죠?"
김철웅 : "2002년 12월에 했거든요. 제가 탈북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북한에서 금지곡으로 되어 있던 북한에서 금지곡이라고 하게 되면 한국에서 대중음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곡들이 자본주의가 만든 문화라고 해서 연주를 하면 안 되는데요. 그런 곡을 유학하면서 듣게 되었고 그 곡을 제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들려주려고 연주했다가.."
남앵커 : "어디서 연주 하신 거예요?"
김철웅 : "연습실에서요. 연습실에서 연습을 했었는데 누가 신고를 해서 문제가 됐어요. 보안부에 가서 시말서를 쓰게 되면서.."
남앵커 : "그 사랑하는 분이 대단하신 분인가요."
김철웅 : "항간의 이슈죠. 장성택씨의 조카딸이었습니다."
남앵커 : "조카딸을 아실 정도면 최상위층 생활에 대해서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장성택 처형이 굉장히 큰 이슈인데 처형 관련된 소식이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김철웅 : "상당히 충격적일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설마 장성택이. 그 사람은 1980년대부터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라서 설마 장성택을 칠 것이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그로 인하여 북한 내부에서 특히 고위층에는 공포 분위기가 돌지 않을까, 제 2의 장성택은 누가 될까. 여러 가지 공포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남앵커 : "장성택 직접 보셨죠?"
김철웅 : "그럼요."
남앵커 : "어떤 분이셨는지요."
김철웅 : "상당히 카리스마 있고 두 번째는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카리스마 속에 리더십이 있는 남성스러움.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의 존경을 무척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남앵커 : "그렇군요. 북한에서 장성택 처형보도가 나왔고 우리나라 남한에서도 처형보도가 나왔는데 양쪽 비교해보니까 어떠셨습니까."
김철웅 : "장성택을 처형하는 장면을 내 보낸 것은 제가 북한에 태어났지만 처음 보는 상황이고요. 북한에서도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내외 효과를 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 해 보고요. 한국에서 처형소식을 내 보내는 것을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꾸 한국 시각으로 보지 말고 북한 시간으로 해법을 찾아보면 좀 더 명확한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북한 눈을 가지고 북한식 해법을 찾아봐야 하는데 한국식 눈을 가지고 북한을 바라보려고 하더라는거죠."
남앵커 : "북한식 해법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김철웅 : "그 사회에 대한 문화적인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왜 이런 것이 나왔는지 훨씬 더 알기 쉬울 텐데, 한국식 눈을 가지고 북한을 바라보다보니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지 않았습니까."
남앵커 : "그 설왕설래 가운데 하나도 리설주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리설주라는 사람은 같이 예술 하는 분, 음악하신 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잘 알려진 분인지요?"
김철웅 : "평범했던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평범했던 사람인데 발탁이 되어서 김정은의 와이프가 됐는데요. 지난번에 문경진 은하수 관현악단 처형수가 나왔는데 그들의 입에도 오를 만큼 너무 평범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리설주의 위상과 관련해서 북한에서는 특급비밀이 군사비밀이나 경제비밀보다 더 극한 비밀이 로열패밀리에 대한 자료거든요. 그런 비밀들이 문경진과 같은 악단에서 녹여지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처형을 하지 않았을까."
남앵커 :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계십니다. 북한의 음악, 남한의 음악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고 어떤 부분에 장점이 있을까요."
김철웅 :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남이 사는 나라, 남이 사는 우리나라, 남이 사는 내 나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 우리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우리 것 다운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콩쿠르에 나가면 자기나라 곡을 한 곡씩 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 곡이 좀 드물더라고요. 많이 있겠지만 알려져있지 않은 것이겠지만.."
남앵커 : "그렇다고 아리랑을 칠 수도 없고요."
김철웅 :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요. 북한의 음악을 놓고 볼 때는 북한도 상당히 클래식 부분은 세계적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노래 속에 수령에 대한 위대성, 당 정책 이런 것들이 함축되어 선전 선동 수단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죠."
남앵커 : "교수님 우리 것 꼭 찾아주시길 바라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웅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북한에서 천재 피아니스트로 이름을 알렸던 청년이 북한을 떠나 지금 한국에서 못 다 이룬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철웅 서울교대 연구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앵커 : "북한에서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피아노를 배우게 됐고 전공까지 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김철웅 : "일단은 부모님 욕심이 좀 들어 간 것 같고요. 북한에서는 1958년에 국회를 통과해서 예체능 분야 조기교육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8살 때부터 평양음악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남앵커 : "어렸을 때부터 충분히 피아노를 배울만한 환경이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김철웅 : "네, 아버님이 고위공직자셨고 어머니는 대학교 교수셨습니다."
남앵커 : "그러셨군요. 탈북 이유가 음악적 자유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탈북을 언제 하셨죠?"
김철웅 : "2002년 12월에 했거든요. 제가 탈북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북한에서 금지곡으로 되어 있던 북한에서 금지곡이라고 하게 되면 한국에서 대중음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곡들이 자본주의가 만든 문화라고 해서 연주를 하면 안 되는데요. 그런 곡을 유학하면서 듣게 되었고 그 곡을 제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들려주려고 연주했다가.."
남앵커 : "어디서 연주 하신 거예요?"
김철웅 : "연습실에서요. 연습실에서 연습을 했었는데 누가 신고를 해서 문제가 됐어요. 보안부에 가서 시말서를 쓰게 되면서.."
남앵커 : "그 사랑하는 분이 대단하신 분인가요."
김철웅 : "항간의 이슈죠. 장성택씨의 조카딸이었습니다."
남앵커 : "조카딸을 아실 정도면 최상위층 생활에 대해서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장성택 처형이 굉장히 큰 이슈인데 처형 관련된 소식이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김철웅 : "상당히 충격적일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설마 장성택이. 그 사람은 1980년대부터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라서 설마 장성택을 칠 것이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그로 인하여 북한 내부에서 특히 고위층에는 공포 분위기가 돌지 않을까, 제 2의 장성택은 누가 될까. 여러 가지 공포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남앵커 : "장성택 직접 보셨죠?"
김철웅 : "그럼요."
남앵커 : "어떤 분이셨는지요."
김철웅 : "상당히 카리스마 있고 두 번째는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카리스마 속에 리더십이 있는 남성스러움.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의 존경을 무척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남앵커 : "그렇군요. 북한에서 장성택 처형보도가 나왔고 우리나라 남한에서도 처형보도가 나왔는데 양쪽 비교해보니까 어떠셨습니까."
김철웅 : "장성택을 처형하는 장면을 내 보낸 것은 제가 북한에 태어났지만 처음 보는 상황이고요. 북한에서도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내외 효과를 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 해 보고요. 한국에서 처형소식을 내 보내는 것을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꾸 한국 시각으로 보지 말고 북한 시간으로 해법을 찾아보면 좀 더 명확한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북한 눈을 가지고 북한식 해법을 찾아봐야 하는데 한국식 눈을 가지고 북한을 바라보려고 하더라는거죠."
남앵커 : "북한식 해법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김철웅 : "그 사회에 대한 문화적인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왜 이런 것이 나왔는지 훨씬 더 알기 쉬울 텐데, 한국식 눈을 가지고 북한을 바라보다보니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지 않았습니까."
남앵커 : "그 설왕설래 가운데 하나도 리설주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리설주라는 사람은 같이 예술 하는 분, 음악하신 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잘 알려진 분인지요?"
김철웅 : "평범했던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평범했던 사람인데 발탁이 되어서 김정은의 와이프가 됐는데요. 지난번에 문경진 은하수 관현악단 처형수가 나왔는데 그들의 입에도 오를 만큼 너무 평범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리설주의 위상과 관련해서 북한에서는 특급비밀이 군사비밀이나 경제비밀보다 더 극한 비밀이 로열패밀리에 대한 자료거든요. 그런 비밀들이 문경진과 같은 악단에서 녹여지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처형을 하지 않았을까."
남앵커 :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계십니다. 북한의 음악, 남한의 음악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고 어떤 부분에 장점이 있을까요."
김철웅 :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남이 사는 나라, 남이 사는 우리나라, 남이 사는 내 나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 우리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우리 것 다운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콩쿠르에 나가면 자기나라 곡을 한 곡씩 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 곡이 좀 드물더라고요. 많이 있겠지만 알려져있지 않은 것이겠지만.."
남앵커 : "그렇다고 아리랑을 칠 수도 없고요."
김철웅 :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요. 북한의 음악을 놓고 볼 때는 북한도 상당히 클래식 부분은 세계적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노래 속에 수령에 대한 위대성, 당 정책 이런 것들이 함축되어 선전 선동 수단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죠."
남앵커 : "교수님 우리 것 꼭 찾아주시길 바라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웅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SNS 이슈] 주택 창문에 ‘뽁뽁이’ 붙이다 50대 남성 추락해 숨져 외](https://news.kbs.co.kr/data/news/2013/12/23/2777120_140.jpg)
![[영상] 김현태 특전사 707단장 “사령관이 <br>‘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말해”](/data/layer/904/2025/02/20250206_7dqUJ4.jpg)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