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시사기획 창 : 쌀, 갈림길에 서다
입력 2014.02.14 (18:04)
수정 2014.02.14 (18: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일자 : 2014년 2월 18일(화) 22:00~22:50 KBS 1TV
□ 취 재 : 박상범
□ 촬 영 : 이병권
□ 기획의도
1995년 이후 20년간 미뤄뒀던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2014년 12월 말로 끝난다. 우리 정부는 3개월 전인 9월말까지 WTO(세계무역기구)에 관세화에 대한 입장을 통보해야 한다.
농민단체들은 쌀 전면 관세화조치(시장개방)는 한국의 쌀 생산기반과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므로 관세화 유예조치를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통상전문가들은 관세화 유예조치를 연장하려면 의무수입물량(2014년 현재 국내소비량의 9%)을 더 늘려야 하고 다른 상품교역에서 추가적인 양보가 불가피하다며 쌀 전면관세화조치를 주장한다.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가운데 사회적 논의도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국가중대사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KBS 시사기획 창은 쌀 관세화의 장. 단점을 입체적으로 취재해 쌀 시장개방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 주요내용
1. 2014년 말 쌀 관세화(시장개방)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찬반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개방 찬성론자들은 전면 관세화를 유예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고 본다. 지금도 국내소비량의 9%에 달하는 의무수입물량을 훨씬 늘려야 하고 다른 상품무역에서도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세화를 해도 4~500%의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쌀이 가격경쟁력을 잃어 쌀시장이나 농민에게 미칠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방반대론자들은 미국의 주도하는 TPP(환태평양 경제협정)에 가입하는 과정이나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관세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만큼 일단 관세유예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 전문가들은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을 통해 치열한 설전을 벌이면서도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2. 취재진은 또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대만과 필리핀 사례를 취재해 쌀 관세화 성공의 조건을 살펴본다. 2002년 WTO에 가입한지 1년 만에 쌀 시장을 개방한 대만은 초기에 쌀값이 폭락하고 농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됐지만 대만정부는 고 품종 벼 개발과 계약재배, 경작면적 조절, 보조금 지급 등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한국처럼 관세화 유예를 받았다가 2012년 유예기간이 만료된 필리핀은 쌀 수출국과 협상중이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필리핀은 쌀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관세를 높게 물릴 수 없는 속사정 때문에 관세화를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입장에 빠져 있다.
3. 정부는 1995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20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기간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모가 큰 기업농을 육성하고 있지만 대농과 소농으로 나뉘면서 소득양극화 현상
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취재진은 전북 익산시의 한그루영농조합법인과 인근 고령농가가 모내기와 농약치기, 추수, 판매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취재해 대농과 소농의 상생모델을 제시한다. 또 농민과 소비자가 결합해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농민은 농산물 제값받기라는 성과를 내고 있는 ‘한 살림 협동조합’의 사례를 취재했다.
□ 취 재 : 박상범
□ 촬 영 : 이병권
□ 기획의도
1995년 이후 20년간 미뤄뒀던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2014년 12월 말로 끝난다. 우리 정부는 3개월 전인 9월말까지 WTO(세계무역기구)에 관세화에 대한 입장을 통보해야 한다.
농민단체들은 쌀 전면 관세화조치(시장개방)는 한국의 쌀 생산기반과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므로 관세화 유예조치를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통상전문가들은 관세화 유예조치를 연장하려면 의무수입물량(2014년 현재 국내소비량의 9%)을 더 늘려야 하고 다른 상품교역에서 추가적인 양보가 불가피하다며 쌀 전면관세화조치를 주장한다.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가운데 사회적 논의도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국가중대사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KBS 시사기획 창은 쌀 관세화의 장. 단점을 입체적으로 취재해 쌀 시장개방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 주요내용
1. 2014년 말 쌀 관세화(시장개방)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찬반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개방 찬성론자들은 전면 관세화를 유예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고 본다. 지금도 국내소비량의 9%에 달하는 의무수입물량을 훨씬 늘려야 하고 다른 상품무역에서도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세화를 해도 4~500%의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쌀이 가격경쟁력을 잃어 쌀시장이나 농민에게 미칠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방반대론자들은 미국의 주도하는 TPP(환태평양 경제협정)에 가입하는 과정이나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관세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만큼 일단 관세유예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 전문가들은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을 통해 치열한 설전을 벌이면서도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2. 취재진은 또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대만과 필리핀 사례를 취재해 쌀 관세화 성공의 조건을 살펴본다. 2002년 WTO에 가입한지 1년 만에 쌀 시장을 개방한 대만은 초기에 쌀값이 폭락하고 농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됐지만 대만정부는 고 품종 벼 개발과 계약재배, 경작면적 조절, 보조금 지급 등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한국처럼 관세화 유예를 받았다가 2012년 유예기간이 만료된 필리핀은 쌀 수출국과 협상중이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필리핀은 쌀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관세를 높게 물릴 수 없는 속사정 때문에 관세화를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입장에 빠져 있다.
3. 정부는 1995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20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기간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모가 큰 기업농을 육성하고 있지만 대농과 소농으로 나뉘면서 소득양극화 현상
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취재진은 전북 익산시의 한그루영농조합법인과 인근 고령농가가 모내기와 농약치기, 추수, 판매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취재해 대농과 소농의 상생모델을 제시한다. 또 농민과 소비자가 결합해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농민은 농산물 제값받기라는 성과를 내고 있는 ‘한 살림 협동조합’의 사례를 취재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리보기] 시사기획 창 : 쌀, 갈림길에 서다
-
- 입력 2014-02-14 18:04:16
- 수정2014-02-14 18:1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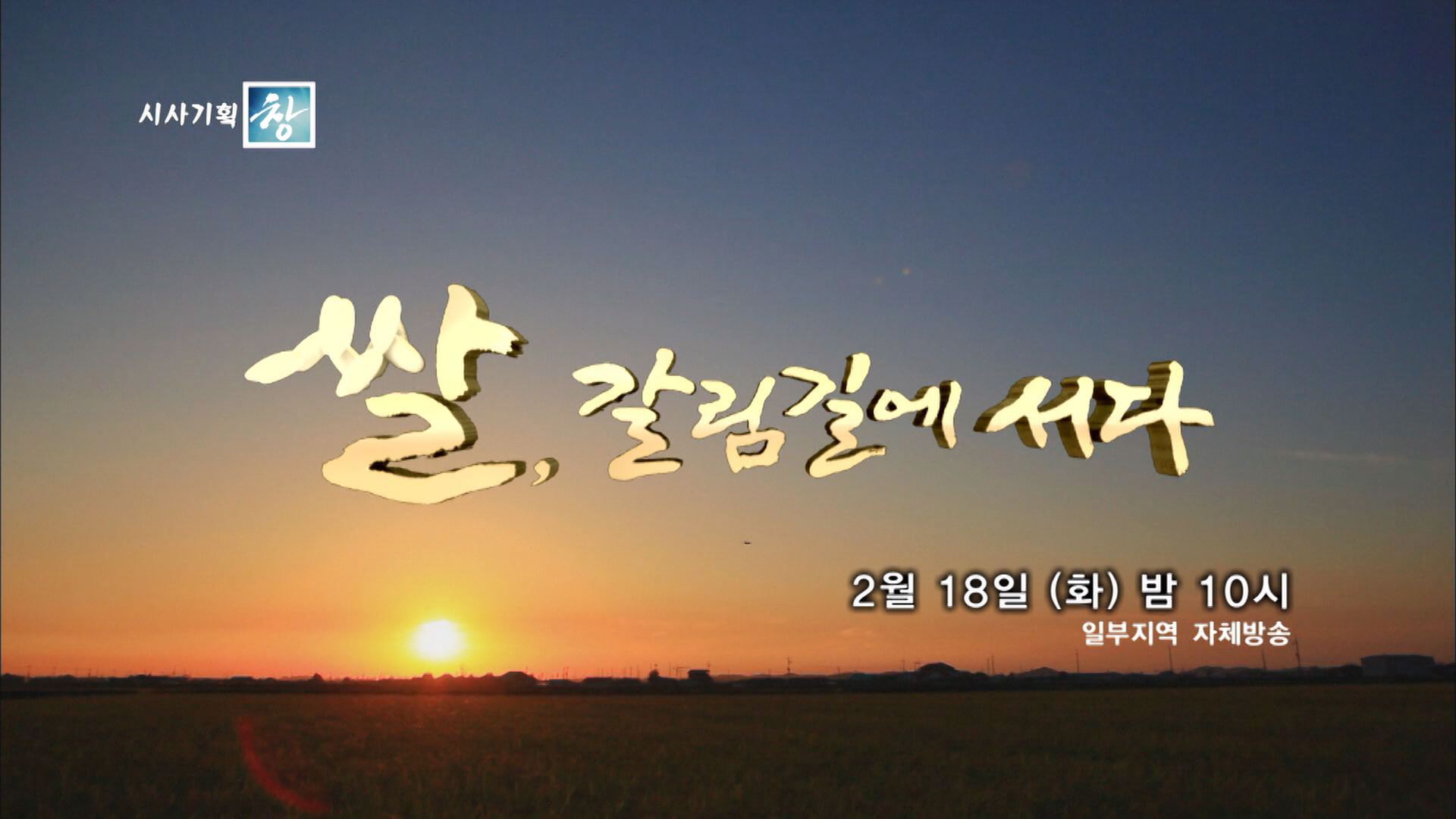
□ 방송일자 : 2014년 2월 18일(화) 22:00~22:50 KBS 1TV
□ 취 재 : 박상범
□ 촬 영 : 이병권
□ 기획의도
1995년 이후 20년간 미뤄뒀던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2014년 12월 말로 끝난다. 우리 정부는 3개월 전인 9월말까지 WTO(세계무역기구)에 관세화에 대한 입장을 통보해야 한다.
농민단체들은 쌀 전면 관세화조치(시장개방)는 한국의 쌀 생산기반과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므로 관세화 유예조치를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통상전문가들은 관세화 유예조치를 연장하려면 의무수입물량(2014년 현재 국내소비량의 9%)을 더 늘려야 하고 다른 상품교역에서 추가적인 양보가 불가피하다며 쌀 전면관세화조치를 주장한다.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가운데 사회적 논의도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국가중대사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KBS 시사기획 창은 쌀 관세화의 장. 단점을 입체적으로 취재해 쌀 시장개방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 주요내용
1. 2014년 말 쌀 관세화(시장개방)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찬반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개방 찬성론자들은 전면 관세화를 유예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고 본다. 지금도 국내소비량의 9%에 달하는 의무수입물량을 훨씬 늘려야 하고 다른 상품무역에서도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세화를 해도 4~500%의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쌀이 가격경쟁력을 잃어 쌀시장이나 농민에게 미칠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방반대론자들은 미국의 주도하는 TPP(환태평양 경제협정)에 가입하는 과정이나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관세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만큼 일단 관세유예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 전문가들은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을 통해 치열한 설전을 벌이면서도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2. 취재진은 또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대만과 필리핀 사례를 취재해 쌀 관세화 성공의 조건을 살펴본다. 2002년 WTO에 가입한지 1년 만에 쌀 시장을 개방한 대만은 초기에 쌀값이 폭락하고 농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됐지만 대만정부는 고 품종 벼 개발과 계약재배, 경작면적 조절, 보조금 지급 등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한국처럼 관세화 유예를 받았다가 2012년 유예기간이 만료된 필리핀은 쌀 수출국과 협상중이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필리핀은 쌀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관세를 높게 물릴 수 없는 속사정 때문에 관세화를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입장에 빠져 있다.
3. 정부는 1995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20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기간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모가 큰 기업농을 육성하고 있지만 대농과 소농으로 나뉘면서 소득양극화 현상
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취재진은 전북 익산시의 한그루영농조합법인과 인근 고령농가가 모내기와 농약치기, 추수, 판매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취재해 대농과 소농의 상생모델을 제시한다. 또 농민과 소비자가 결합해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농민은 농산물 제값받기라는 성과를 내고 있는 ‘한 살림 협동조합’의 사례를 취재했다.
□ 취 재 : 박상범
□ 촬 영 : 이병권
□ 기획의도
1995년 이후 20년간 미뤄뒀던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2014년 12월 말로 끝난다. 우리 정부는 3개월 전인 9월말까지 WTO(세계무역기구)에 관세화에 대한 입장을 통보해야 한다.
농민단체들은 쌀 전면 관세화조치(시장개방)는 한국의 쌀 생산기반과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므로 관세화 유예조치를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통상전문가들은 관세화 유예조치를 연장하려면 의무수입물량(2014년 현재 국내소비량의 9%)을 더 늘려야 하고 다른 상품교역에서 추가적인 양보가 불가피하다며 쌀 전면관세화조치를 주장한다.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가운데 사회적 논의도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국가중대사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KBS 시사기획 창은 쌀 관세화의 장. 단점을 입체적으로 취재해 쌀 시장개방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 주요내용
1. 2014년 말 쌀 관세화(시장개방)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찬반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개방 찬성론자들은 전면 관세화를 유예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고 본다. 지금도 국내소비량의 9%에 달하는 의무수입물량을 훨씬 늘려야 하고 다른 상품무역에서도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세화를 해도 4~500%의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쌀이 가격경쟁력을 잃어 쌀시장이나 농민에게 미칠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방반대론자들은 미국의 주도하는 TPP(환태평양 경제협정)에 가입하는 과정이나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관세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만큼 일단 관세유예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 전문가들은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을 통해 치열한 설전을 벌이면서도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2. 취재진은 또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대만과 필리핀 사례를 취재해 쌀 관세화 성공의 조건을 살펴본다. 2002년 WTO에 가입한지 1년 만에 쌀 시장을 개방한 대만은 초기에 쌀값이 폭락하고 농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됐지만 대만정부는 고 품종 벼 개발과 계약재배, 경작면적 조절, 보조금 지급 등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한국처럼 관세화 유예를 받았다가 2012년 유예기간이 만료된 필리핀은 쌀 수출국과 협상중이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필리핀은 쌀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관세를 높게 물릴 수 없는 속사정 때문에 관세화를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입장에 빠져 있다.
3. 정부는 1995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20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기간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모가 큰 기업농을 육성하고 있지만 대농과 소농으로 나뉘면서 소득양극화 현상
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취재진은 전북 익산시의 한그루영농조합법인과 인근 고령농가가 모내기와 농약치기, 추수, 판매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취재해 대농과 소농의 상생모델을 제시한다. 또 농민과 소비자가 결합해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농민은 농산물 제값받기라는 성과를 내고 있는 ‘한 살림 협동조합’의 사례를 취재했다.
-
-

박상범 기자 david@kbs.co.kr
박상범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단독] ‘공천개입 핵심 물증’ 윤상현 휴대전화 미제출…야간 추가 압수수색도 실패](/data/layer/904/2025/07/20250709_dRidEM.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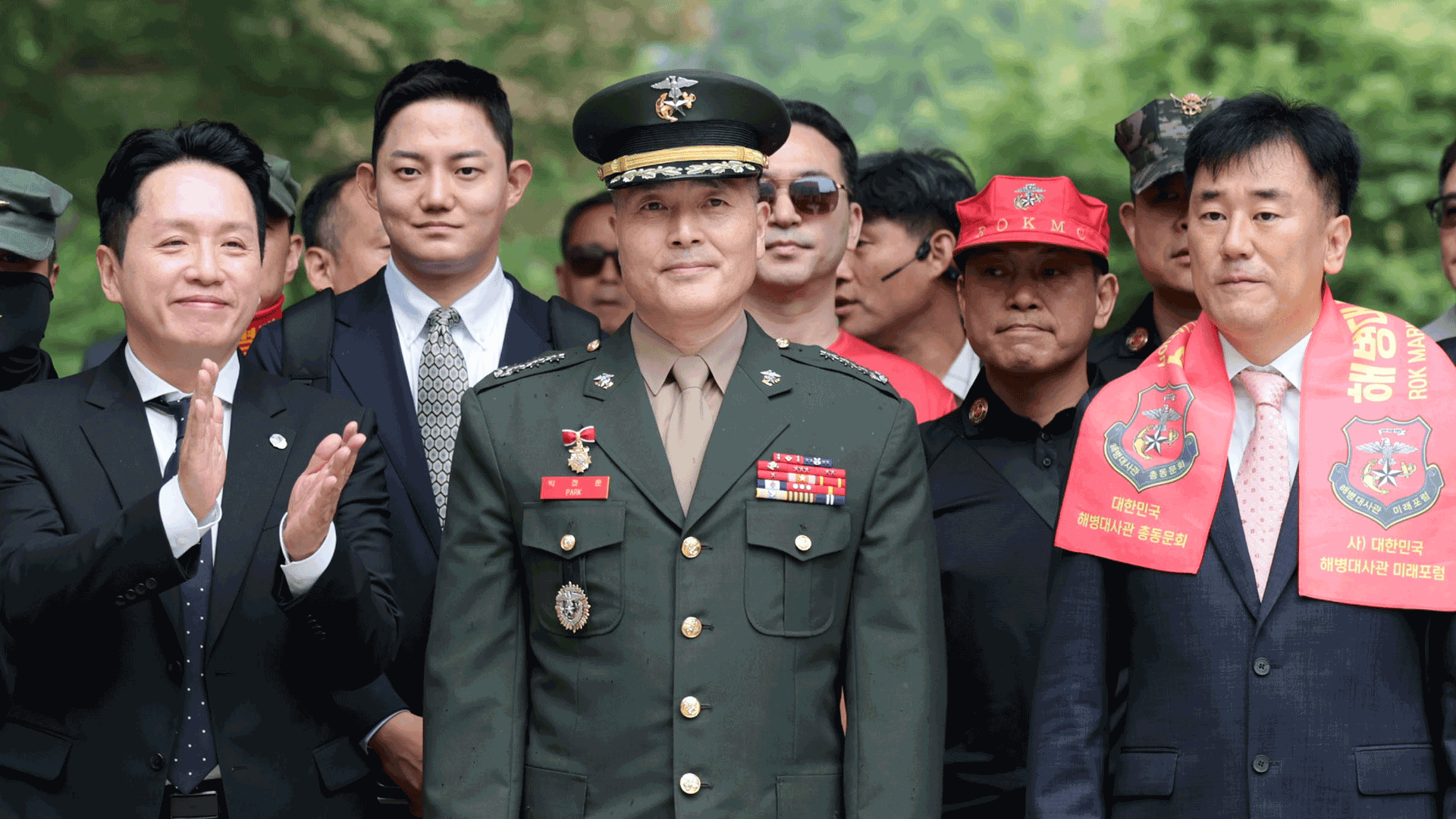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