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때와 달리 말레이기로부터 왜 전화 없었나?
입력 2014.03.18 (14:43)
수정 2014.03.18 (19: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당시 비행기 4대가 테러범들에 납치됐을 때 승객과 승무원들은 휴대전화를 켜 가족이나 공항관리, 당국 등에 내부 상황을 알렸다.
하지만 이번에 열흘 넘게 실종 상태인 말레이시아 항공 MH370기의 경우 항로를 벗어나고 말레이시아 도시 상공 등을 날 기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승객과 승무원들의 전화는 침묵했다.
사고기 승객 다수인 말레이시아인과 중국인이 아시아권에서도 유달리 휴대전화를 많이 쓰는 '이동통신족(族)'으로 유명한데도 말이다.
18일 뉴욕타임스(NYT)와 온라인 잡지 슬레이트의 분석을 보면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서 휴대전화를 쓰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휴대전화는 비행기의 고도가 3천 피트(0.914㎞)만 넘어서도 지상 기지국에 전파가 닿지 않아 '통화권 이탈' 상태가 된다.
사고기는 정상 항로를 이탈하고 나서 3천피트의 10배 안팎인 2만3천∼4만5천 피트 고도로 날았던 만큼 휴대전화로 구조를 요청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고기가 특정 지역 착륙 등을 위해 고도를 대거 낮춰 지상에 근접해 날더라도 난관이 많다. 기체가 정글이나 외딴 인도양 섬 등 오지에 있다면 기지국이 없어 전화가 불통이 되기 십상이다.
또 승객들이 국외 로밍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외국 기지국이 주변에 있어도 아예 전화를 못 썼을 것이라고 통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이와 달리 9·11 테러 당시 납치 여객기는 휴대전화 서비스가 고루 되는 미국 동부 지역을 낮은 고도로 날았고 다들 국내선이라 로밍 문제도 없었다.
말레이시아 항공기의 비즈니스석에는 고도·위치에 관계없이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위성전화가 있지만 이 장치는 조종사가 차단할 수 있다.
사고기가 새벽 비행기였다는 사실도 문제다. 승객 대부분이 운항 내내 잠을 자는 경우가 많은 만큼 비행기가 납치돼 다른 경로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좌석 모니터에 나오는 운항 정보 화면을 보고 경로 이탈을 눈치 챌 수 있겠지만, 이 화면은 마음만 먹으면 조종석에서 끌 수 있다.
휴대전화는 기기를 켜놓으면 통화를 하지 않아도 약 20초마다 한 번씩 주변 기지국을 찾으려고 신호를 발산한다.
이 때문에 승객들의 휴대전화 신호를 탐지한다면 비행기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금껏 이런 실마리는 확인되지 않았다.
잡지 슬레이트는 애초 승객들이 항공사 규정에 따라 이륙 뒤 다들 휴대전화를 꺼버렸거나 신호 발신을 하지 않는 '비행모드'(에어플레인 모드)로 기기를 전환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설령 비행기가 납치된다는 것을 알고 서둘러 휴대전화를 켜더라도 그때 이미 기체는 신호 추적이 어려운 오지에 들어섰을 것이라는 얘기다.
일부 승객의 휴대전화가 실종 이후에도 전화를 걸면 계속 신호음이 들린다는 중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승객이 계속 휴대전화를 쓴다는 증거로 보긴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고 NYT는 전했다.
신호음은 통신망이 해당 번호 단말기를 검색하는 과정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휴대전화가 온전한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열흘 넘게 실종 상태인 말레이시아 항공 MH370기의 경우 항로를 벗어나고 말레이시아 도시 상공 등을 날 기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승객과 승무원들의 전화는 침묵했다.
사고기 승객 다수인 말레이시아인과 중국인이 아시아권에서도 유달리 휴대전화를 많이 쓰는 '이동통신족(族)'으로 유명한데도 말이다.
18일 뉴욕타임스(NYT)와 온라인 잡지 슬레이트의 분석을 보면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서 휴대전화를 쓰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휴대전화는 비행기의 고도가 3천 피트(0.914㎞)만 넘어서도 지상 기지국에 전파가 닿지 않아 '통화권 이탈' 상태가 된다.
사고기는 정상 항로를 이탈하고 나서 3천피트의 10배 안팎인 2만3천∼4만5천 피트 고도로 날았던 만큼 휴대전화로 구조를 요청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고기가 특정 지역 착륙 등을 위해 고도를 대거 낮춰 지상에 근접해 날더라도 난관이 많다. 기체가 정글이나 외딴 인도양 섬 등 오지에 있다면 기지국이 없어 전화가 불통이 되기 십상이다.
또 승객들이 국외 로밍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외국 기지국이 주변에 있어도 아예 전화를 못 썼을 것이라고 통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이와 달리 9·11 테러 당시 납치 여객기는 휴대전화 서비스가 고루 되는 미국 동부 지역을 낮은 고도로 날았고 다들 국내선이라 로밍 문제도 없었다.
말레이시아 항공기의 비즈니스석에는 고도·위치에 관계없이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위성전화가 있지만 이 장치는 조종사가 차단할 수 있다.
사고기가 새벽 비행기였다는 사실도 문제다. 승객 대부분이 운항 내내 잠을 자는 경우가 많은 만큼 비행기가 납치돼 다른 경로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좌석 모니터에 나오는 운항 정보 화면을 보고 경로 이탈을 눈치 챌 수 있겠지만, 이 화면은 마음만 먹으면 조종석에서 끌 수 있다.
휴대전화는 기기를 켜놓으면 통화를 하지 않아도 약 20초마다 한 번씩 주변 기지국을 찾으려고 신호를 발산한다.
이 때문에 승객들의 휴대전화 신호를 탐지한다면 비행기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금껏 이런 실마리는 확인되지 않았다.
잡지 슬레이트는 애초 승객들이 항공사 규정에 따라 이륙 뒤 다들 휴대전화를 꺼버렸거나 신호 발신을 하지 않는 '비행모드'(에어플레인 모드)로 기기를 전환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설령 비행기가 납치된다는 것을 알고 서둘러 휴대전화를 켜더라도 그때 이미 기체는 신호 추적이 어려운 오지에 들어섰을 것이라는 얘기다.
일부 승객의 휴대전화가 실종 이후에도 전화를 걸면 계속 신호음이 들린다는 중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승객이 계속 휴대전화를 쓴다는 증거로 보긴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고 NYT는 전했다.
신호음은 통신망이 해당 번호 단말기를 검색하는 과정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휴대전화가 온전한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9·11 때와 달리 말레이기로부터 왜 전화 없었나?
-
- 입력 2014-03-18 14:43:53
- 수정2014-03-18 19:15:39
2001년 9·11 테러 당시 비행기 4대가 테러범들에 납치됐을 때 승객과 승무원들은 휴대전화를 켜 가족이나 공항관리, 당국 등에 내부 상황을 알렸다.
하지만 이번에 열흘 넘게 실종 상태인 말레이시아 항공 MH370기의 경우 항로를 벗어나고 말레이시아 도시 상공 등을 날 기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승객과 승무원들의 전화는 침묵했다.
사고기 승객 다수인 말레이시아인과 중국인이 아시아권에서도 유달리 휴대전화를 많이 쓰는 '이동통신족(族)'으로 유명한데도 말이다.
18일 뉴욕타임스(NYT)와 온라인 잡지 슬레이트의 분석을 보면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서 휴대전화를 쓰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휴대전화는 비행기의 고도가 3천 피트(0.914㎞)만 넘어서도 지상 기지국에 전파가 닿지 않아 '통화권 이탈' 상태가 된다.
사고기는 정상 항로를 이탈하고 나서 3천피트의 10배 안팎인 2만3천∼4만5천 피트 고도로 날았던 만큼 휴대전화로 구조를 요청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고기가 특정 지역 착륙 등을 위해 고도를 대거 낮춰 지상에 근접해 날더라도 난관이 많다. 기체가 정글이나 외딴 인도양 섬 등 오지에 있다면 기지국이 없어 전화가 불통이 되기 십상이다.
또 승객들이 국외 로밍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외국 기지국이 주변에 있어도 아예 전화를 못 썼을 것이라고 통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이와 달리 9·11 테러 당시 납치 여객기는 휴대전화 서비스가 고루 되는 미국 동부 지역을 낮은 고도로 날았고 다들 국내선이라 로밍 문제도 없었다.
말레이시아 항공기의 비즈니스석에는 고도·위치에 관계없이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위성전화가 있지만 이 장치는 조종사가 차단할 수 있다.
사고기가 새벽 비행기였다는 사실도 문제다. 승객 대부분이 운항 내내 잠을 자는 경우가 많은 만큼 비행기가 납치돼 다른 경로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좌석 모니터에 나오는 운항 정보 화면을 보고 경로 이탈을 눈치 챌 수 있겠지만, 이 화면은 마음만 먹으면 조종석에서 끌 수 있다.
휴대전화는 기기를 켜놓으면 통화를 하지 않아도 약 20초마다 한 번씩 주변 기지국을 찾으려고 신호를 발산한다.
이 때문에 승객들의 휴대전화 신호를 탐지한다면 비행기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금껏 이런 실마리는 확인되지 않았다.
잡지 슬레이트는 애초 승객들이 항공사 규정에 따라 이륙 뒤 다들 휴대전화를 꺼버렸거나 신호 발신을 하지 않는 '비행모드'(에어플레인 모드)로 기기를 전환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설령 비행기가 납치된다는 것을 알고 서둘러 휴대전화를 켜더라도 그때 이미 기체는 신호 추적이 어려운 오지에 들어섰을 것이라는 얘기다.
일부 승객의 휴대전화가 실종 이후에도 전화를 걸면 계속 신호음이 들린다는 중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승객이 계속 휴대전화를 쓴다는 증거로 보긴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고 NYT는 전했다.
신호음은 통신망이 해당 번호 단말기를 검색하는 과정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휴대전화가 온전한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열흘 넘게 실종 상태인 말레이시아 항공 MH370기의 경우 항로를 벗어나고 말레이시아 도시 상공 등을 날 기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승객과 승무원들의 전화는 침묵했다.
사고기 승객 다수인 말레이시아인과 중국인이 아시아권에서도 유달리 휴대전화를 많이 쓰는 '이동통신족(族)'으로 유명한데도 말이다.
18일 뉴욕타임스(NYT)와 온라인 잡지 슬레이트의 분석을 보면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서 휴대전화를 쓰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휴대전화는 비행기의 고도가 3천 피트(0.914㎞)만 넘어서도 지상 기지국에 전파가 닿지 않아 '통화권 이탈' 상태가 된다.
사고기는 정상 항로를 이탈하고 나서 3천피트의 10배 안팎인 2만3천∼4만5천 피트 고도로 날았던 만큼 휴대전화로 구조를 요청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고기가 특정 지역 착륙 등을 위해 고도를 대거 낮춰 지상에 근접해 날더라도 난관이 많다. 기체가 정글이나 외딴 인도양 섬 등 오지에 있다면 기지국이 없어 전화가 불통이 되기 십상이다.
또 승객들이 국외 로밍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외국 기지국이 주변에 있어도 아예 전화를 못 썼을 것이라고 통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이와 달리 9·11 테러 당시 납치 여객기는 휴대전화 서비스가 고루 되는 미국 동부 지역을 낮은 고도로 날았고 다들 국내선이라 로밍 문제도 없었다.
말레이시아 항공기의 비즈니스석에는 고도·위치에 관계없이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위성전화가 있지만 이 장치는 조종사가 차단할 수 있다.
사고기가 새벽 비행기였다는 사실도 문제다. 승객 대부분이 운항 내내 잠을 자는 경우가 많은 만큼 비행기가 납치돼 다른 경로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좌석 모니터에 나오는 운항 정보 화면을 보고 경로 이탈을 눈치 챌 수 있겠지만, 이 화면은 마음만 먹으면 조종석에서 끌 수 있다.
휴대전화는 기기를 켜놓으면 통화를 하지 않아도 약 20초마다 한 번씩 주변 기지국을 찾으려고 신호를 발산한다.
이 때문에 승객들의 휴대전화 신호를 탐지한다면 비행기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금껏 이런 실마리는 확인되지 않았다.
잡지 슬레이트는 애초 승객들이 항공사 규정에 따라 이륙 뒤 다들 휴대전화를 꺼버렸거나 신호 발신을 하지 않는 '비행모드'(에어플레인 모드)로 기기를 전환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설령 비행기가 납치된다는 것을 알고 서둘러 휴대전화를 켜더라도 그때 이미 기체는 신호 추적이 어려운 오지에 들어섰을 것이라는 얘기다.
일부 승객의 휴대전화가 실종 이후에도 전화를 걸면 계속 신호음이 들린다는 중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승객이 계속 휴대전화를 쓴다는 증거로 보긴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고 NYT는 전했다.
신호음은 통신망이 해당 번호 단말기를 검색하는 과정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휴대전화가 온전한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속보] 위성락 “통상·투자·안보 전반 패키지로 <br>관세 협의 진전시킬 것…미국 측 공감”](/data/layer/904/2025/07/20250709_u4yjkF.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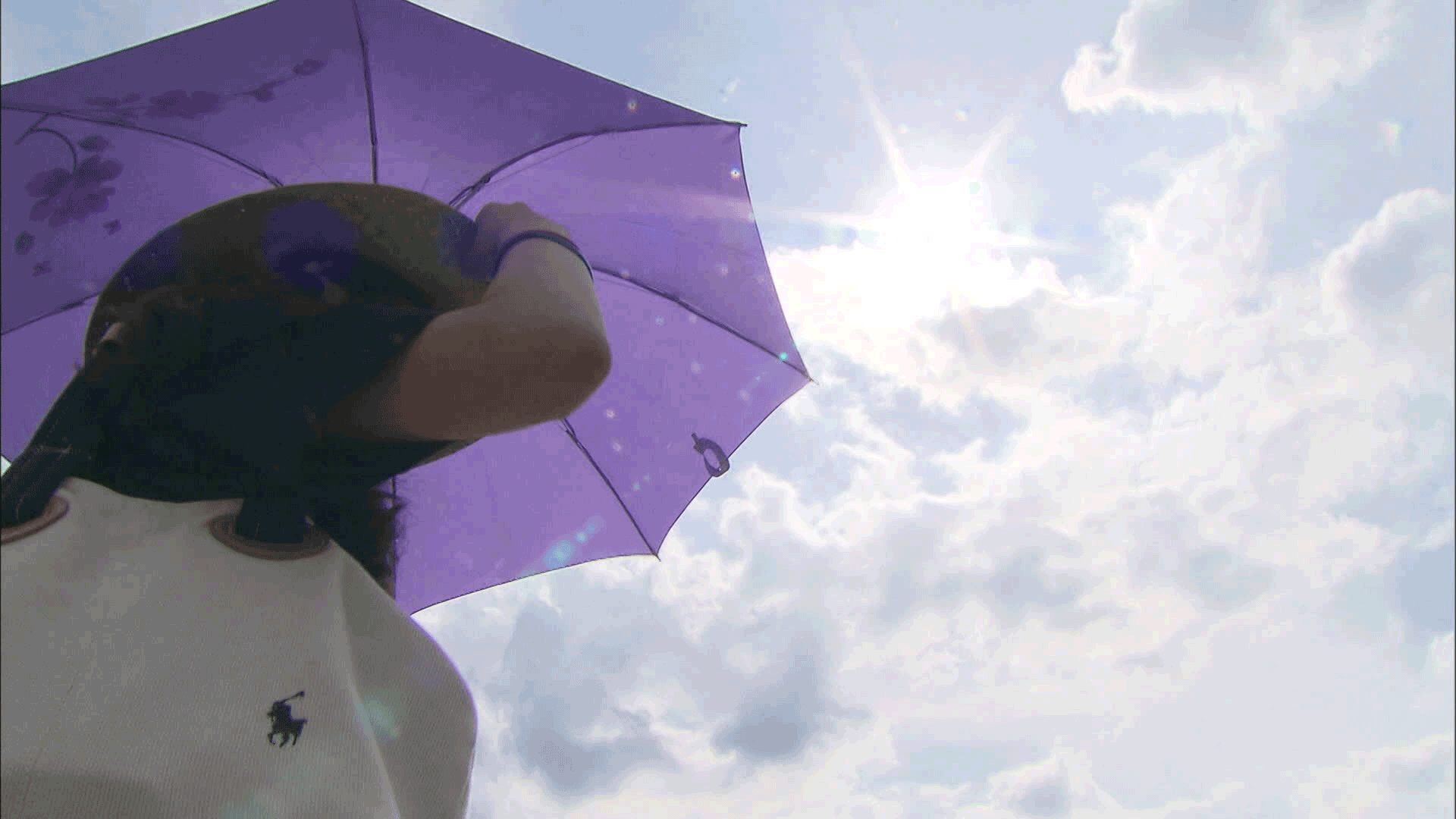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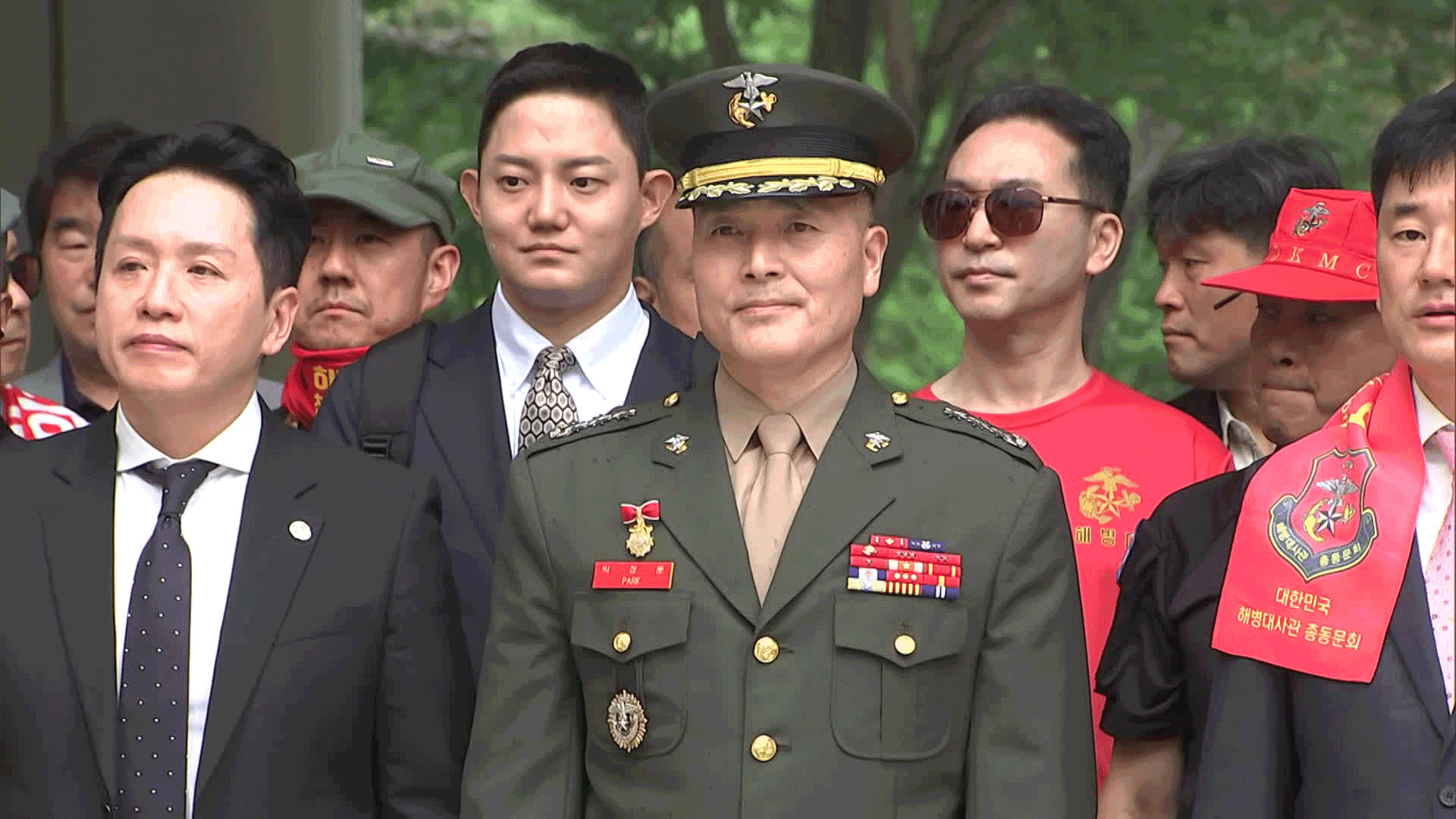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