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출범하면 3심 사건 대부분 담당
입력 2014.09.24 (16:41)
수정 2014.09.24 (19: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24일 공개한 상고법원 도입방안의 핵심은 급증하는 상고사건 중 사회적·법률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을 상고법원에서 처리토록 한다는 것이다.
상고법원이 일반 권리구제 사건 심판을 도맡게 되면 대법원은 '사회적·법률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어서 정책법원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구상이다.
지난 2012년 기준 상고사건은 3만5천776건으로 2002년(1만8천600건)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jpg)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1인당 연간 3천여건을 처리한 셈이다. 반면 상고사건 중 전원합의체에서 처리한 사건 수는 2012년 28건으로 전체의 0.1%에도 못미쳤다.
대법원 판결의 신뢰성 제고, 소수자 보호,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 제고를 위해서는 전체 대법관의 경륜과 지혜의 총체인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을 숙고하고 토론을 거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고심 구조하에서는 밀려드는 사건 부담으로 인해 국민 관심이 크고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건이더라도 전원합의체에 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
대법원이 마련한 개편안에 따르면 상고법원이 설치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모든 상고사건은 대법원 소부 내지 전원합의체에서 실질적 중요성을 심사해 상고법원에서 처리할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담당할지를 결정한다.
대법원에서 사건 심사를 하게 되면 모든 사건에 대해 대법관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사건 당사자의 현실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같은 방식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을 선정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지금도 대법원은 소부에 배당된 사건 중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거나 중요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내리고 있다.
다만 중요사건 심사 기준이 대법관의 재량에 달려 있어 자의적 판단이 될 수 있고 사건 심사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개편안은 대법관 심사 없이 대법원에서 심판하는 필수적 대법원 심판사건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헌법 또는 기존 다른 법률에 의해 대법원이 반드시 심판해야 하는 사건으로는 군사법원 사건, 조례무효 등 지방자치법상 쟁송 사건,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선거·당선 소송, 특별시·광역시 및 도 주민투표 소송 등이 있다.
당선무효가 내려질 수 있는 공직선거법 사건 등 재판 결과가 공적 이익과 관련이 있는 사건 역시 별도 심사 없이 대법원이 담당한다.
일반 형사사건 중 항소심에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 재판 결과가 당사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법원이 심판을 맡도록 했다.
당초 대법원은 상고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대법원과 상고법원의 사건분류 방식 중 하나로 획일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을 함께 고민했었다.
민사·가사·행정사건은 소송가액(소가)에 따라, 형사사건은 항소심 선고 형량에 따라 구분하는 방안, 고법이나 특허법원에서 상고되는 사건은 대법원에서, 지법 항소부에서 상고되는 사건은 상고법원에서 담당하는 방안 등이 검토됐다.
그러나 획일적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건의 중요성 여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고 소가가 낮은 경제적 약자의 사건은 대법원이 아닌 상고법원에서 처리되는 점, 대법원의 사건 부담을 크게 줄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 배제하기로 했다.
상고법원이 일반 권리구제 사건 심판을 도맡게 되면 대법원은 '사회적·법률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어서 정책법원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구상이다.
지난 2012년 기준 상고사건은 3만5천776건으로 2002년(1만8천600건)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jpg)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1인당 연간 3천여건을 처리한 셈이다. 반면 상고사건 중 전원합의체에서 처리한 사건 수는 2012년 28건으로 전체의 0.1%에도 못미쳤다.
대법원 판결의 신뢰성 제고, 소수자 보호,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 제고를 위해서는 전체 대법관의 경륜과 지혜의 총체인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을 숙고하고 토론을 거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고심 구조하에서는 밀려드는 사건 부담으로 인해 국민 관심이 크고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건이더라도 전원합의체에 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
대법원이 마련한 개편안에 따르면 상고법원이 설치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모든 상고사건은 대법원 소부 내지 전원합의체에서 실질적 중요성을 심사해 상고법원에서 처리할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담당할지를 결정한다.
대법원에서 사건 심사를 하게 되면 모든 사건에 대해 대법관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사건 당사자의 현실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같은 방식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을 선정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지금도 대법원은 소부에 배당된 사건 중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거나 중요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내리고 있다.
다만 중요사건 심사 기준이 대법관의 재량에 달려 있어 자의적 판단이 될 수 있고 사건 심사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개편안은 대법관 심사 없이 대법원에서 심판하는 필수적 대법원 심판사건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헌법 또는 기존 다른 법률에 의해 대법원이 반드시 심판해야 하는 사건으로는 군사법원 사건, 조례무효 등 지방자치법상 쟁송 사건,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선거·당선 소송, 특별시·광역시 및 도 주민투표 소송 등이 있다.
당선무효가 내려질 수 있는 공직선거법 사건 등 재판 결과가 공적 이익과 관련이 있는 사건 역시 별도 심사 없이 대법원이 담당한다.
일반 형사사건 중 항소심에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 재판 결과가 당사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법원이 심판을 맡도록 했다.
당초 대법원은 상고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대법원과 상고법원의 사건분류 방식 중 하나로 획일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을 함께 고민했었다.
민사·가사·행정사건은 소송가액(소가)에 따라, 형사사건은 항소심 선고 형량에 따라 구분하는 방안, 고법이나 특허법원에서 상고되는 사건은 대법원에서, 지법 항소부에서 상고되는 사건은 상고법원에서 담당하는 방안 등이 검토됐다.
그러나 획일적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건의 중요성 여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고 소가가 낮은 경제적 약자의 사건은 대법원이 아닌 상고법원에서 처리되는 점, 대법원의 사건 부담을 크게 줄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 배제하기로 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상고법원 출범하면 3심 사건 대부분 담당
-
- 입력 2014-09-24 16:41:48
- 수정2014-09-24 19:27:11
대법원이 24일 공개한 상고법원 도입방안의 핵심은 급증하는 상고사건 중 사회적·법률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을 상고법원에서 처리토록 한다는 것이다.
상고법원이 일반 권리구제 사건 심판을 도맡게 되면 대법원은 '사회적·법률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어서 정책법원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구상이다.
지난 2012년 기준 상고사건은 3만5천776건으로 2002년(1만8천600건)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jpg)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1인당 연간 3천여건을 처리한 셈이다. 반면 상고사건 중 전원합의체에서 처리한 사건 수는 2012년 28건으로 전체의 0.1%에도 못미쳤다.
대법원 판결의 신뢰성 제고, 소수자 보호,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 제고를 위해서는 전체 대법관의 경륜과 지혜의 총체인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을 숙고하고 토론을 거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고심 구조하에서는 밀려드는 사건 부담으로 인해 국민 관심이 크고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건이더라도 전원합의체에 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
대법원이 마련한 개편안에 따르면 상고법원이 설치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모든 상고사건은 대법원 소부 내지 전원합의체에서 실질적 중요성을 심사해 상고법원에서 처리할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담당할지를 결정한다.
대법원에서 사건 심사를 하게 되면 모든 사건에 대해 대법관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사건 당사자의 현실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같은 방식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을 선정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지금도 대법원은 소부에 배당된 사건 중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거나 중요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내리고 있다.
다만 중요사건 심사 기준이 대법관의 재량에 달려 있어 자의적 판단이 될 수 있고 사건 심사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개편안은 대법관 심사 없이 대법원에서 심판하는 필수적 대법원 심판사건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헌법 또는 기존 다른 법률에 의해 대법원이 반드시 심판해야 하는 사건으로는 군사법원 사건, 조례무효 등 지방자치법상 쟁송 사건,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선거·당선 소송, 특별시·광역시 및 도 주민투표 소송 등이 있다.
당선무효가 내려질 수 있는 공직선거법 사건 등 재판 결과가 공적 이익과 관련이 있는 사건 역시 별도 심사 없이 대법원이 담당한다.
일반 형사사건 중 항소심에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 재판 결과가 당사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법원이 심판을 맡도록 했다.
당초 대법원은 상고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대법원과 상고법원의 사건분류 방식 중 하나로 획일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을 함께 고민했었다.
민사·가사·행정사건은 소송가액(소가)에 따라, 형사사건은 항소심 선고 형량에 따라 구분하는 방안, 고법이나 특허법원에서 상고되는 사건은 대법원에서, 지법 항소부에서 상고되는 사건은 상고법원에서 담당하는 방안 등이 검토됐다.
그러나 획일적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건의 중요성 여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고 소가가 낮은 경제적 약자의 사건은 대법원이 아닌 상고법원에서 처리되는 점, 대법원의 사건 부담을 크게 줄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 배제하기로 했다.
상고법원이 일반 권리구제 사건 심판을 도맡게 되면 대법원은 '사회적·법률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어서 정책법원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구상이다.
지난 2012년 기준 상고사건은 3만5천776건으로 2002년(1만8천600건)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jpg)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1인당 연간 3천여건을 처리한 셈이다. 반면 상고사건 중 전원합의체에서 처리한 사건 수는 2012년 28건으로 전체의 0.1%에도 못미쳤다.
대법원 판결의 신뢰성 제고, 소수자 보호,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 제고를 위해서는 전체 대법관의 경륜과 지혜의 총체인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을 숙고하고 토론을 거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고심 구조하에서는 밀려드는 사건 부담으로 인해 국민 관심이 크고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건이더라도 전원합의체에 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
대법원이 마련한 개편안에 따르면 상고법원이 설치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모든 상고사건은 대법원 소부 내지 전원합의체에서 실질적 중요성을 심사해 상고법원에서 처리할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담당할지를 결정한다.
대법원에서 사건 심사를 하게 되면 모든 사건에 대해 대법관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사건 당사자의 현실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같은 방식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을 선정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지금도 대법원은 소부에 배당된 사건 중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거나 중요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내리고 있다.
다만 중요사건 심사 기준이 대법관의 재량에 달려 있어 자의적 판단이 될 수 있고 사건 심사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개편안은 대법관 심사 없이 대법원에서 심판하는 필수적 대법원 심판사건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헌법 또는 기존 다른 법률에 의해 대법원이 반드시 심판해야 하는 사건으로는 군사법원 사건, 조례무효 등 지방자치법상 쟁송 사건,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선거·당선 소송, 특별시·광역시 및 도 주민투표 소송 등이 있다.
당선무효가 내려질 수 있는 공직선거법 사건 등 재판 결과가 공적 이익과 관련이 있는 사건 역시 별도 심사 없이 대법원이 담당한다.
일반 형사사건 중 항소심에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 재판 결과가 당사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법원이 심판을 맡도록 했다.
당초 대법원은 상고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대법원과 상고법원의 사건분류 방식 중 하나로 획일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을 함께 고민했었다.
민사·가사·행정사건은 소송가액(소가)에 따라, 형사사건은 항소심 선고 형량에 따라 구분하는 방안, 고법이나 특허법원에서 상고되는 사건은 대법원에서, 지법 항소부에서 상고되는 사건은 상고법원에서 담당하는 방안 등이 검토됐다.
그러나 획일적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건의 중요성 여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고 소가가 낮은 경제적 약자의 사건은 대법원이 아닌 상고법원에서 처리되는 점, 대법원의 사건 부담을 크게 줄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 배제하기로 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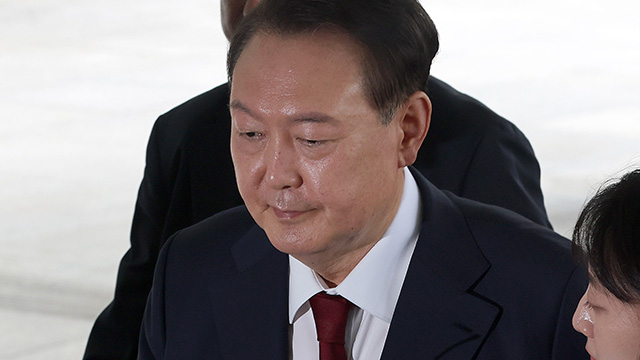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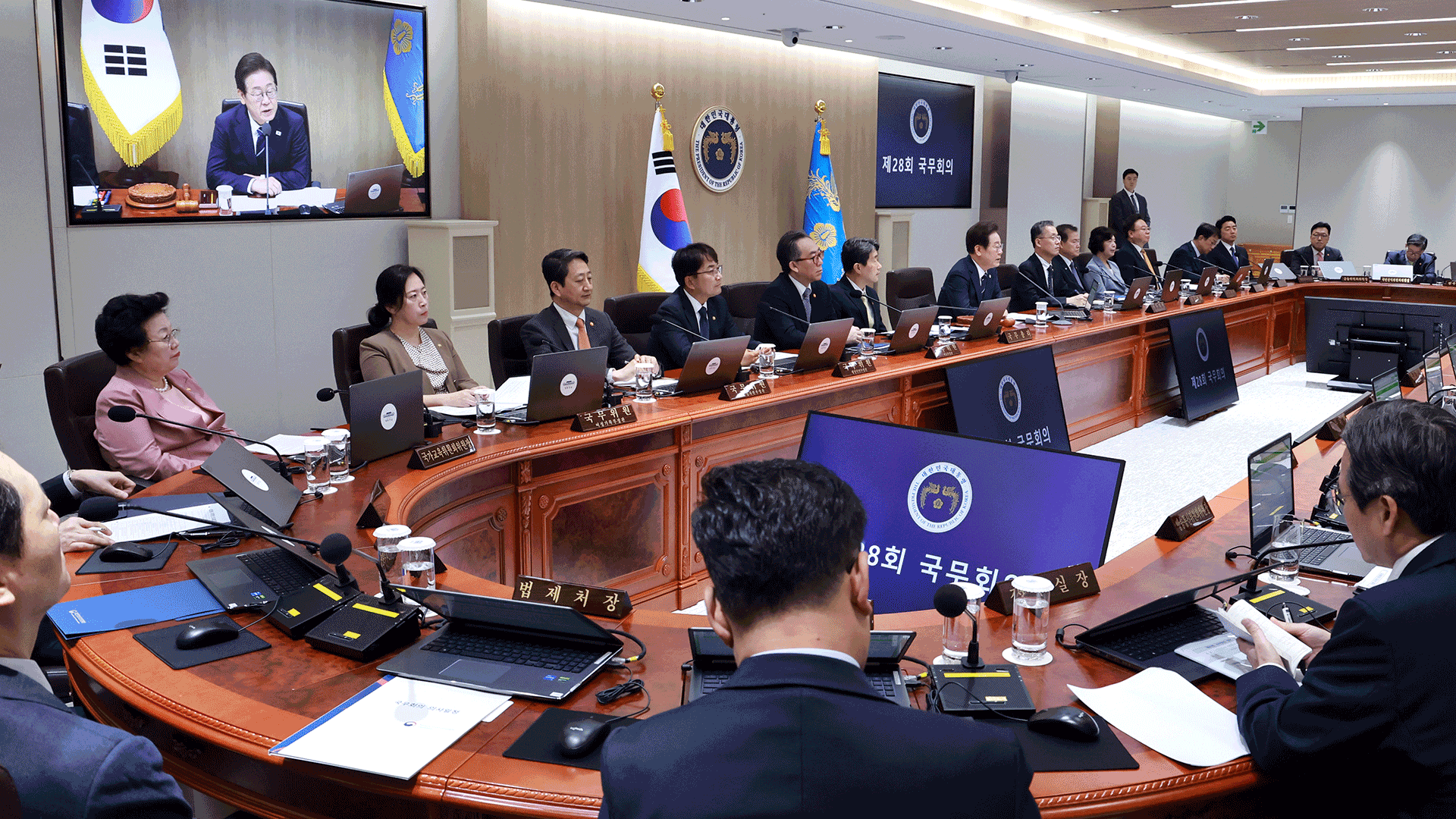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