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공사한 다음부터 2~30kg씩 잡히던 고기를 이젠 1~2kg 잡기도 힘듭니다. 씨가 말랐어요."
낙동강 하구에서 고기잡이를 한다는 50대 어민은 절박했습니다. 조업을 할수록 손해가 아니냐는 질문에 "배 띄워도 면세유 값도 못 건진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빨리 다른 일을 찾을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법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생업을 하루 아침에 내려놓는 건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일 겁니다. 고기가 안 잡힐 걸 알면서도 배를 타는 어민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어민 70명이 속해있는 부산 구포어촌계, 직접 가본 선착장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배들은 하릴없이 묶여있고 선착장의 활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민들은 이곳에서 여름엔 장어, 겨울엔 붕어와 잉어를 잡으며 생계를 이어왔는데, 이제는 배타기를 포기한 어민이 점점 늘어간다고 합니다. '물량'도 안 되는 고기를 거래처에 딱히 팔기도 어렵다면서.
고기가 사라진 이유는 '4대강 사업' 때문이라고 모두 입을 모았습니다. 2009년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공사로 함안보가 생긴 뒤 강물이 양쪽으로 가로막혀 제대로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느려진 유속 때문에 퇴적물이 쌓였고 뻘은 썩어갔습니다. 공사 때문에 수초가 사라져 '고기밥'도 없어졌습니다. 녹조로 인한 피해도 컸습니다. 녹조를 없애려고 수문을 불규칙하게 열다보니 강에 놔둔 어구도 함께 떠밀려가기 일쑤였습니다.
그간 정부는 이런 어민들의 피해를 줄곧 외면해 왔습니다. 어민들은 지난 2012년 국토교통부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보상을 거절하자 성난 어민들은 국가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국토부에 피해 실태 정밀 조사를 권고했고, 그때서야 용역이 이뤄졌습니다.
.jpg)
용역 결과는 어민들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국토부가 부산의 한 대학교에 의뢰해 지난 1년 동안 비공개 용역을 진행한 결과, 4대강 사업 전후로 낙동강 유역의 연 평균 어획량은 약 30%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그물을 이용한 하루 어획량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알려졌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어민의 피해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된 겁니다.
.jpg)
용역 결과로 산정된 보상금은 총 77억, 보상 대상은 약 2천 가구입니다. 지역은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 즉 낙동강 유역으로 한정됐습니다. 이 일대 강과 바다에서 어업 허가를 받은 천970여 가구가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단순히 1가구 당 보상금액을 계산했을 때 400만 원 가량이 나오는데, 어민들은 금액이 적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지난 3~4년 동안의 피해에 대한 대가치곤 너무 적다는 겁니다. 물론 평균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받는 어민도 있겠지만, 보상금 총액 자체가 현실적인 피해 보상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유사 보상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 어민들이 보상을 받았다면, 비슷한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 어민들도 보상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영산강과 금강, 한강 지역 어민들에 대한 추가 보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민걸 공주대 환경교육과 교수는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다른 지역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이미 4대강 사업에 22조 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공사 후유증으로 인한 보상금이 또 줄줄이 나갈 판입니다. 그 보상금을 결국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한다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주기재 부산대 생명공학과 교수는 "예상했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났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거대 국책사업의 뒤치다꺼리는 '모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jpg)
구포어촌계에서 가장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어민에게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어떡하실 예정이냐고. "고기 잡아서 먹고 살기는 힘들겠죠. 다른 일을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반평생 어민으로 산 예순의 그는 앞으로가 막막해보였습니다. 생계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되뇌였습니다. 평균 '400만 원'을 받아내는 데도 이렇게 힘겨웠는데, 현실적인 대책을 얻어내려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할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실현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jpg)
그나마 보상을 받으면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민들은 4대강 사업 전과 후의 소득 변화를 자료를 통해 증명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힘든 피해와 사회적 비용은 보상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일을 벌인 주체와 책임을 지는 주체는 일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가기[뉴스9]‘4대강 사업’ 어업 피해 첫 인정…“77억 원 보상”
낙동강 하구에서 고기잡이를 한다는 50대 어민은 절박했습니다. 조업을 할수록 손해가 아니냐는 질문에 "배 띄워도 면세유 값도 못 건진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빨리 다른 일을 찾을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법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생업을 하루 아침에 내려놓는 건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일 겁니다. 고기가 안 잡힐 걸 알면서도 배를 타는 어민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어민 70명이 속해있는 부산 구포어촌계, 직접 가본 선착장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배들은 하릴없이 묶여있고 선착장의 활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민들은 이곳에서 여름엔 장어, 겨울엔 붕어와 잉어를 잡으며 생계를 이어왔는데, 이제는 배타기를 포기한 어민이 점점 늘어간다고 합니다. '물량'도 안 되는 고기를 거래처에 딱히 팔기도 어렵다면서.
고기가 사라진 이유는 '4대강 사업' 때문이라고 모두 입을 모았습니다. 2009년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공사로 함안보가 생긴 뒤 강물이 양쪽으로 가로막혀 제대로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느려진 유속 때문에 퇴적물이 쌓였고 뻘은 썩어갔습니다. 공사 때문에 수초가 사라져 '고기밥'도 없어졌습니다. 녹조로 인한 피해도 컸습니다. 녹조를 없애려고 수문을 불규칙하게 열다보니 강에 놔둔 어구도 함께 떠밀려가기 일쑤였습니다.
그간 정부는 이런 어민들의 피해를 줄곧 외면해 왔습니다. 어민들은 지난 2012년 국토교통부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보상을 거절하자 성난 어민들은 국가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국토부에 피해 실태 정밀 조사를 권고했고, 그때서야 용역이 이뤄졌습니다.
.jpg)
용역 결과는 어민들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국토부가 부산의 한 대학교에 의뢰해 지난 1년 동안 비공개 용역을 진행한 결과, 4대강 사업 전후로 낙동강 유역의 연 평균 어획량은 약 30%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그물을 이용한 하루 어획량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알려졌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어민의 피해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된 겁니다.
.jpg)
용역 결과로 산정된 보상금은 총 77억, 보상 대상은 약 2천 가구입니다. 지역은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 즉 낙동강 유역으로 한정됐습니다. 이 일대 강과 바다에서 어업 허가를 받은 천970여 가구가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단순히 1가구 당 보상금액을 계산했을 때 400만 원 가량이 나오는데, 어민들은 금액이 적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지난 3~4년 동안의 피해에 대한 대가치곤 너무 적다는 겁니다. 물론 평균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받는 어민도 있겠지만, 보상금 총액 자체가 현실적인 피해 보상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유사 보상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 어민들이 보상을 받았다면, 비슷한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 어민들도 보상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영산강과 금강, 한강 지역 어민들에 대한 추가 보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민걸 공주대 환경교육과 교수는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다른 지역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이미 4대강 사업에 22조 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공사 후유증으로 인한 보상금이 또 줄줄이 나갈 판입니다. 그 보상금을 결국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한다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주기재 부산대 생명공학과 교수는 "예상했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났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거대 국책사업의 뒤치다꺼리는 '모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jpg)
구포어촌계에서 가장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어민에게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어떡하실 예정이냐고. "고기 잡아서 먹고 살기는 힘들겠죠. 다른 일을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반평생 어민으로 산 예순의 그는 앞으로가 막막해보였습니다. 생계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되뇌였습니다. 평균 '400만 원'을 받아내는 데도 이렇게 힘겨웠는데, 현실적인 대책을 얻어내려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할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실현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jpg)
그나마 보상을 받으면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민들은 4대강 사업 전과 후의 소득 변화를 자료를 통해 증명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힘든 피해와 사회적 비용은 보상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일을 벌인 주체와 책임을 지는 주체는 일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가기[뉴스9]‘4대강 사업’ 어업 피해 첫 인정…“77억 원 보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취재후] 4대강 사업 피해 보상금은 누구 돈으로?
-
- 입력 2015-01-23 09:55:21

"4대강 공사한 다음부터 2~30kg씩 잡히던 고기를 이젠 1~2kg 잡기도 힘듭니다. 씨가 말랐어요."
낙동강 하구에서 고기잡이를 한다는 50대 어민은 절박했습니다. 조업을 할수록 손해가 아니냐는 질문에 "배 띄워도 면세유 값도 못 건진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빨리 다른 일을 찾을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법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생업을 하루 아침에 내려놓는 건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일 겁니다. 고기가 안 잡힐 걸 알면서도 배를 타는 어민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어민 70명이 속해있는 부산 구포어촌계, 직접 가본 선착장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배들은 하릴없이 묶여있고 선착장의 활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민들은 이곳에서 여름엔 장어, 겨울엔 붕어와 잉어를 잡으며 생계를 이어왔는데, 이제는 배타기를 포기한 어민이 점점 늘어간다고 합니다. '물량'도 안 되는 고기를 거래처에 딱히 팔기도 어렵다면서.
고기가 사라진 이유는 '4대강 사업' 때문이라고 모두 입을 모았습니다. 2009년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공사로 함안보가 생긴 뒤 강물이 양쪽으로 가로막혀 제대로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느려진 유속 때문에 퇴적물이 쌓였고 뻘은 썩어갔습니다. 공사 때문에 수초가 사라져 '고기밥'도 없어졌습니다. 녹조로 인한 피해도 컸습니다. 녹조를 없애려고 수문을 불규칙하게 열다보니 강에 놔둔 어구도 함께 떠밀려가기 일쑤였습니다.
그간 정부는 이런 어민들의 피해를 줄곧 외면해 왔습니다. 어민들은 지난 2012년 국토교통부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보상을 거절하자 성난 어민들은 국가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국토부에 피해 실태 정밀 조사를 권고했고, 그때서야 용역이 이뤄졌습니다.
.jpg) 용역 결과는 어민들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국토부가 부산의 한 대학교에 의뢰해 지난 1년 동안 비공개 용역을 진행한 결과, 4대강 사업 전후로 낙동강 유역의 연 평균 어획량은 약 30%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그물을 이용한 하루 어획량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알려졌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어민의 피해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된 겁니다.
용역 결과는 어민들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국토부가 부산의 한 대학교에 의뢰해 지난 1년 동안 비공개 용역을 진행한 결과, 4대강 사업 전후로 낙동강 유역의 연 평균 어획량은 약 30%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그물을 이용한 하루 어획량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알려졌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어민의 피해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된 겁니다.
.jpg) 용역 결과로 산정된 보상금은 총 77억, 보상 대상은 약 2천 가구입니다. 지역은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 즉 낙동강 유역으로 한정됐습니다. 이 일대 강과 바다에서 어업 허가를 받은 천970여 가구가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단순히 1가구 당 보상금액을 계산했을 때 400만 원 가량이 나오는데, 어민들은 금액이 적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지난 3~4년 동안의 피해에 대한 대가치곤 너무 적다는 겁니다. 물론 평균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받는 어민도 있겠지만, 보상금 총액 자체가 현실적인 피해 보상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유사 보상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 어민들이 보상을 받았다면, 비슷한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 어민들도 보상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영산강과 금강, 한강 지역 어민들에 대한 추가 보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민걸 공주대 환경교육과 교수는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다른 지역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이미 4대강 사업에 22조 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공사 후유증으로 인한 보상금이 또 줄줄이 나갈 판입니다. 그 보상금을 결국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한다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주기재 부산대 생명공학과 교수는 "예상했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났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거대 국책사업의 뒤치다꺼리는 '모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용역 결과로 산정된 보상금은 총 77억, 보상 대상은 약 2천 가구입니다. 지역은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 즉 낙동강 유역으로 한정됐습니다. 이 일대 강과 바다에서 어업 허가를 받은 천970여 가구가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단순히 1가구 당 보상금액을 계산했을 때 400만 원 가량이 나오는데, 어민들은 금액이 적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지난 3~4년 동안의 피해에 대한 대가치곤 너무 적다는 겁니다. 물론 평균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받는 어민도 있겠지만, 보상금 총액 자체가 현실적인 피해 보상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유사 보상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 어민들이 보상을 받았다면, 비슷한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 어민들도 보상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영산강과 금강, 한강 지역 어민들에 대한 추가 보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민걸 공주대 환경교육과 교수는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다른 지역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이미 4대강 사업에 22조 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공사 후유증으로 인한 보상금이 또 줄줄이 나갈 판입니다. 그 보상금을 결국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한다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주기재 부산대 생명공학과 교수는 "예상했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났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거대 국책사업의 뒤치다꺼리는 '모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jpg) 구포어촌계에서 가장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어민에게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어떡하실 예정이냐고. "고기 잡아서 먹고 살기는 힘들겠죠. 다른 일을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반평생 어민으로 산 예순의 그는 앞으로가 막막해보였습니다. 생계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되뇌였습니다. 평균 '400만 원'을 받아내는 데도 이렇게 힘겨웠는데, 현실적인 대책을 얻어내려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할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실현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구포어촌계에서 가장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어민에게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어떡하실 예정이냐고. "고기 잡아서 먹고 살기는 힘들겠죠. 다른 일을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반평생 어민으로 산 예순의 그는 앞으로가 막막해보였습니다. 생계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되뇌였습니다. 평균 '400만 원'을 받아내는 데도 이렇게 힘겨웠는데, 현실적인 대책을 얻어내려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할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실현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jpg) 그나마 보상을 받으면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민들은 4대강 사업 전과 후의 소득 변화를 자료를 통해 증명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힘든 피해와 사회적 비용은 보상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일을 벌인 주체와 책임을 지는 주체는 일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가기[뉴스9]‘4대강 사업’ 어업 피해 첫 인정…“77억 원 보상”
그나마 보상을 받으면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민들은 4대강 사업 전과 후의 소득 변화를 자료를 통해 증명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힘든 피해와 사회적 비용은 보상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일을 벌인 주체와 책임을 지는 주체는 일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가기[뉴스9]‘4대강 사업’ 어업 피해 첫 인정…“77억 원 보상”
.jpg) 용역 결과는 어민들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국토부가 부산의 한 대학교에 의뢰해 지난 1년 동안 비공개 용역을 진행한 결과, 4대강 사업 전후로 낙동강 유역의 연 평균 어획량은 약 30%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그물을 이용한 하루 어획량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알려졌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어민의 피해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된 겁니다.
용역 결과는 어민들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국토부가 부산의 한 대학교에 의뢰해 지난 1년 동안 비공개 용역을 진행한 결과, 4대강 사업 전후로 낙동강 유역의 연 평균 어획량은 약 30%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그물을 이용한 하루 어획량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알려졌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어민의 피해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된 겁니다.
.jpg) 용역 결과로 산정된 보상금은 총 77억, 보상 대상은 약 2천 가구입니다. 지역은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 즉 낙동강 유역으로 한정됐습니다. 이 일대 강과 바다에서 어업 허가를 받은 천970여 가구가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단순히 1가구 당 보상금액을 계산했을 때 400만 원 가량이 나오는데, 어민들은 금액이 적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지난 3~4년 동안의 피해에 대한 대가치곤 너무 적다는 겁니다. 물론 평균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받는 어민도 있겠지만, 보상금 총액 자체가 현실적인 피해 보상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유사 보상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 어민들이 보상을 받았다면, 비슷한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 어민들도 보상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영산강과 금강, 한강 지역 어민들에 대한 추가 보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민걸 공주대 환경교육과 교수는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다른 지역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이미 4대강 사업에 22조 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공사 후유증으로 인한 보상금이 또 줄줄이 나갈 판입니다. 그 보상금을 결국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한다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주기재 부산대 생명공학과 교수는 "예상했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났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거대 국책사업의 뒤치다꺼리는 '모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용역 결과로 산정된 보상금은 총 77억, 보상 대상은 약 2천 가구입니다. 지역은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 즉 낙동강 유역으로 한정됐습니다. 이 일대 강과 바다에서 어업 허가를 받은 천970여 가구가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단순히 1가구 당 보상금액을 계산했을 때 400만 원 가량이 나오는데, 어민들은 금액이 적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지난 3~4년 동안의 피해에 대한 대가치곤 너무 적다는 겁니다. 물론 평균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받는 어민도 있겠지만, 보상금 총액 자체가 현실적인 피해 보상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유사 보상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 어민들이 보상을 받았다면, 비슷한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 어민들도 보상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영산강과 금강, 한강 지역 어민들에 대한 추가 보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민걸 공주대 환경교육과 교수는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다른 지역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이미 4대강 사업에 22조 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공사 후유증으로 인한 보상금이 또 줄줄이 나갈 판입니다. 그 보상금을 결국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한다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주기재 부산대 생명공학과 교수는 "예상했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났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거대 국책사업의 뒤치다꺼리는 '모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jpg) 구포어촌계에서 가장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어민에게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어떡하실 예정이냐고. "고기 잡아서 먹고 살기는 힘들겠죠. 다른 일을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반평생 어민으로 산 예순의 그는 앞으로가 막막해보였습니다. 생계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되뇌였습니다. 평균 '400만 원'을 받아내는 데도 이렇게 힘겨웠는데, 현실적인 대책을 얻어내려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할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실현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구포어촌계에서 가장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어민에게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어떡하실 예정이냐고. "고기 잡아서 먹고 살기는 힘들겠죠. 다른 일을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반평생 어민으로 산 예순의 그는 앞으로가 막막해보였습니다. 생계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되뇌였습니다. 평균 '400만 원'을 받아내는 데도 이렇게 힘겨웠는데, 현실적인 대책을 얻어내려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할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실현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jpg) 그나마 보상을 받으면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민들은 4대강 사업 전과 후의 소득 변화를 자료를 통해 증명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힘든 피해와 사회적 비용은 보상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일을 벌인 주체와 책임을 지는 주체는 일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가기[뉴스9]‘4대강 사업’ 어업 피해 첫 인정…“77억 원 보상”
그나마 보상을 받으면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민들은 4대강 사업 전과 후의 소득 변화를 자료를 통해 증명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힘든 피해와 사회적 비용은 보상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일을 벌인 주체와 책임을 지는 주체는 일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가기[뉴스9]‘4대강 사업’ 어업 피해 첫 인정…“77억 원 보상”-
-

김홍희 기자 moi@kbs.co.kr
김홍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단독] 김건희 특검, ‘공천 개입’ 관련 김영선 전 의원 소환 통보…일정 조율 중](/data/news/2025/07/16/20250716_p7hDHF.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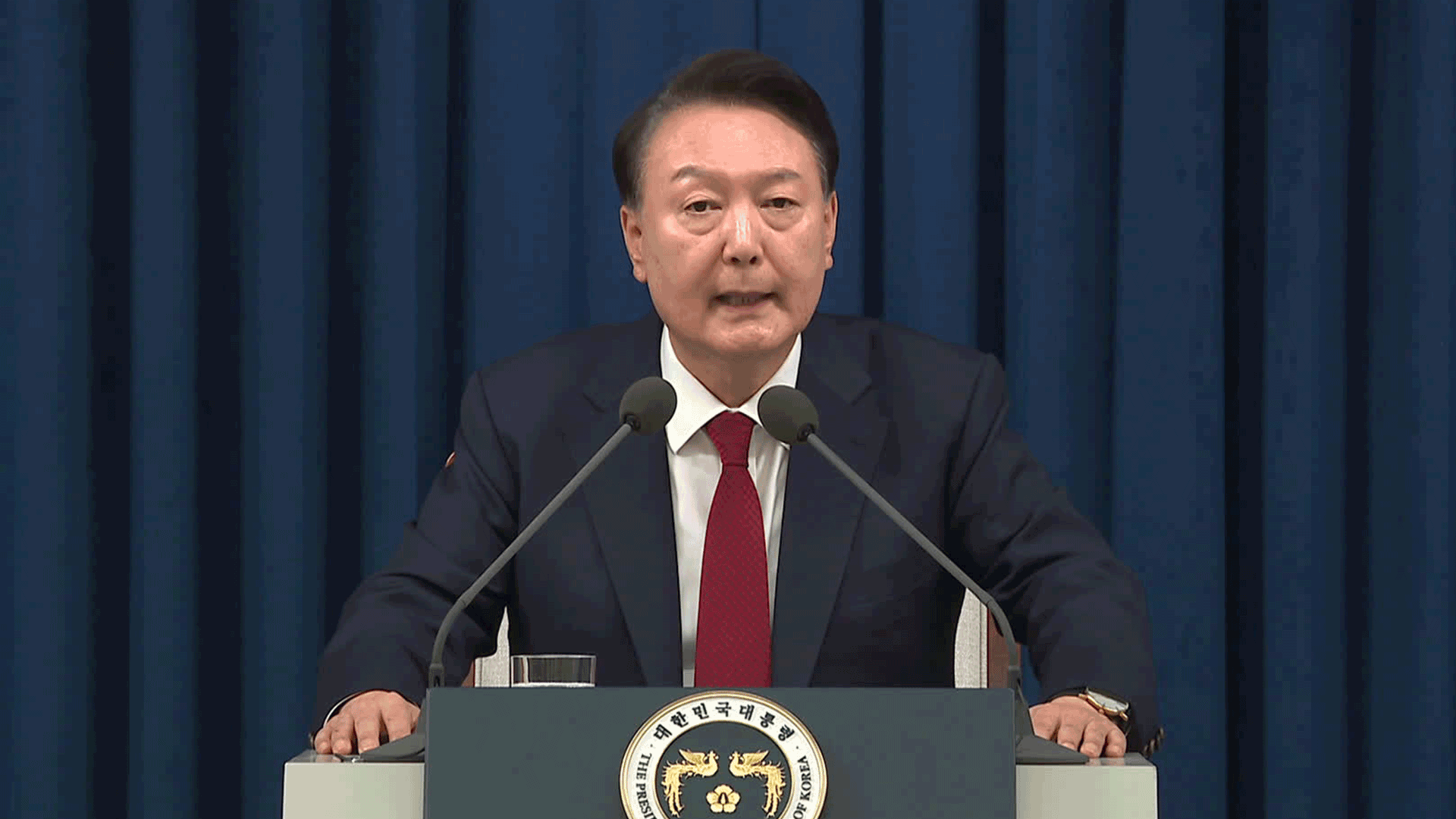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