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in경인] 무제…해석은 관객 몫?
입력 2015.06.04 (21:40)
수정 2015.06.04 (21: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미술관에 가면 자주 볼 수 작품 이름이 '무제'인데요,
작품도 어려운데 제목마저 없어 어떻게 이해하고 감상해야할지 난감하신 적 있으시죠?
작가는 왜 제목을 달지 않았을까요?
그 해답을 찾아가는 특별한 전시회를 송명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면장갑으로 만든 독특한 입체감과 질감의 조형물.
작품명은 '무제',
작가가 이름을 붙이지 않았으니 해석은 관객의 몫입니다.
<인터뷰> 김장수 : "따뜻한 느낌이 나서 '사랑'이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인터뷰> 김부식 : "저는 '하나'라고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정선자 <인터뷰> 아버지요. 장갑을 보니까 아버지 손이 생각났고..."
<인터뷰> 민경혜 : "어~고된 노동"
관객이 직접 작품에 제목을 붙여보는 전시회.
각자의 삶의 방식이 다른 것처럼 관점에 따라 제목도 제각각입니다.
그렇다면 작가는 왜 제목을 달지 않았을까?
사실, 늘 심각한 이유가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인터뷰> 김창열(작가) : "그 당시의 멋이에요. 뭔가 아무것도 없는것처럼 하면서도 뭔가 울림이 있을 것 같은.."
<인터뷰> 양주혜(작가) : "저는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몰라서..."
뒤집어보면 나만의 방식으로 작품을 보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상법이라는 얘깁니다.
<인터뷰> 임대근(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 "제목달기의 권한을 대중들에게 돌려줘서 대중이 마음대로 제목을 붙이고 자기의 상상력을 더해서 작품을 해석하라는 의미에서..."
나만의 제목을 곰곰히 생각해 볼 때 관객은 이미 작품과 대화를 시작한 겁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미술관에 가면 자주 볼 수 작품 이름이 '무제'인데요,
작품도 어려운데 제목마저 없어 어떻게 이해하고 감상해야할지 난감하신 적 있으시죠?
작가는 왜 제목을 달지 않았을까요?
그 해답을 찾아가는 특별한 전시회를 송명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면장갑으로 만든 독특한 입체감과 질감의 조형물.
작품명은 '무제',
작가가 이름을 붙이지 않았으니 해석은 관객의 몫입니다.
<인터뷰> 김장수 : "따뜻한 느낌이 나서 '사랑'이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인터뷰> 김부식 : "저는 '하나'라고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정선자 <인터뷰> 아버지요. 장갑을 보니까 아버지 손이 생각났고..."
<인터뷰> 민경혜 : "어~고된 노동"
관객이 직접 작품에 제목을 붙여보는 전시회.
각자의 삶의 방식이 다른 것처럼 관점에 따라 제목도 제각각입니다.
그렇다면 작가는 왜 제목을 달지 않았을까?
사실, 늘 심각한 이유가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인터뷰> 김창열(작가) : "그 당시의 멋이에요. 뭔가 아무것도 없는것처럼 하면서도 뭔가 울림이 있을 것 같은.."
<인터뷰> 양주혜(작가) : "저는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몰라서..."
뒤집어보면 나만의 방식으로 작품을 보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상법이라는 얘깁니다.
<인터뷰> 임대근(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 "제목달기의 권한을 대중들에게 돌려줘서 대중이 마음대로 제목을 붙이고 자기의 상상력을 더해서 작품을 해석하라는 의미에서..."
나만의 제목을 곰곰히 생각해 볼 때 관객은 이미 작품과 대화를 시작한 겁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문화in경인] 무제…해석은 관객 몫?
-
- 입력 2015-06-04 21:49:53
- 수정2015-06-04 21:58:36

<앵커 멘트>
미술관에 가면 자주 볼 수 작품 이름이 '무제'인데요,
작품도 어려운데 제목마저 없어 어떻게 이해하고 감상해야할지 난감하신 적 있으시죠?
작가는 왜 제목을 달지 않았을까요?
그 해답을 찾아가는 특별한 전시회를 송명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면장갑으로 만든 독특한 입체감과 질감의 조형물.
작품명은 '무제',
작가가 이름을 붙이지 않았으니 해석은 관객의 몫입니다.
<인터뷰> 김장수 : "따뜻한 느낌이 나서 '사랑'이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인터뷰> 김부식 : "저는 '하나'라고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정선자 <인터뷰> 아버지요. 장갑을 보니까 아버지 손이 생각났고..."
<인터뷰> 민경혜 : "어~고된 노동"
관객이 직접 작품에 제목을 붙여보는 전시회.
각자의 삶의 방식이 다른 것처럼 관점에 따라 제목도 제각각입니다.
그렇다면 작가는 왜 제목을 달지 않았을까?
사실, 늘 심각한 이유가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인터뷰> 김창열(작가) : "그 당시의 멋이에요. 뭔가 아무것도 없는것처럼 하면서도 뭔가 울림이 있을 것 같은.."
<인터뷰> 양주혜(작가) : "저는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몰라서..."
뒤집어보면 나만의 방식으로 작품을 보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상법이라는 얘깁니다.
<인터뷰> 임대근(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 "제목달기의 권한을 대중들에게 돌려줘서 대중이 마음대로 제목을 붙이고 자기의 상상력을 더해서 작품을 해석하라는 의미에서..."
나만의 제목을 곰곰히 생각해 볼 때 관객은 이미 작품과 대화를 시작한 겁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미술관에 가면 자주 볼 수 작품 이름이 '무제'인데요,
작품도 어려운데 제목마저 없어 어떻게 이해하고 감상해야할지 난감하신 적 있으시죠?
작가는 왜 제목을 달지 않았을까요?
그 해답을 찾아가는 특별한 전시회를 송명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면장갑으로 만든 독특한 입체감과 질감의 조형물.
작품명은 '무제',
작가가 이름을 붙이지 않았으니 해석은 관객의 몫입니다.
<인터뷰> 김장수 : "따뜻한 느낌이 나서 '사랑'이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인터뷰> 김부식 : "저는 '하나'라고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정선자 <인터뷰> 아버지요. 장갑을 보니까 아버지 손이 생각났고..."
<인터뷰> 민경혜 : "어~고된 노동"
관객이 직접 작품에 제목을 붙여보는 전시회.
각자의 삶의 방식이 다른 것처럼 관점에 따라 제목도 제각각입니다.
그렇다면 작가는 왜 제목을 달지 않았을까?
사실, 늘 심각한 이유가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인터뷰> 김창열(작가) : "그 당시의 멋이에요. 뭔가 아무것도 없는것처럼 하면서도 뭔가 울림이 있을 것 같은.."
<인터뷰> 양주혜(작가) : "저는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몰라서..."
뒤집어보면 나만의 방식으로 작품을 보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상법이라는 얘깁니다.
<인터뷰> 임대근(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 "제목달기의 권한을 대중들에게 돌려줘서 대중이 마음대로 제목을 붙이고 자기의 상상력을 더해서 작품을 해석하라는 의미에서..."
나만의 제목을 곰곰히 생각해 볼 때 관객은 이미 작품과 대화를 시작한 겁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
-

송명훈 기자 smh@kbs.co.kr
송명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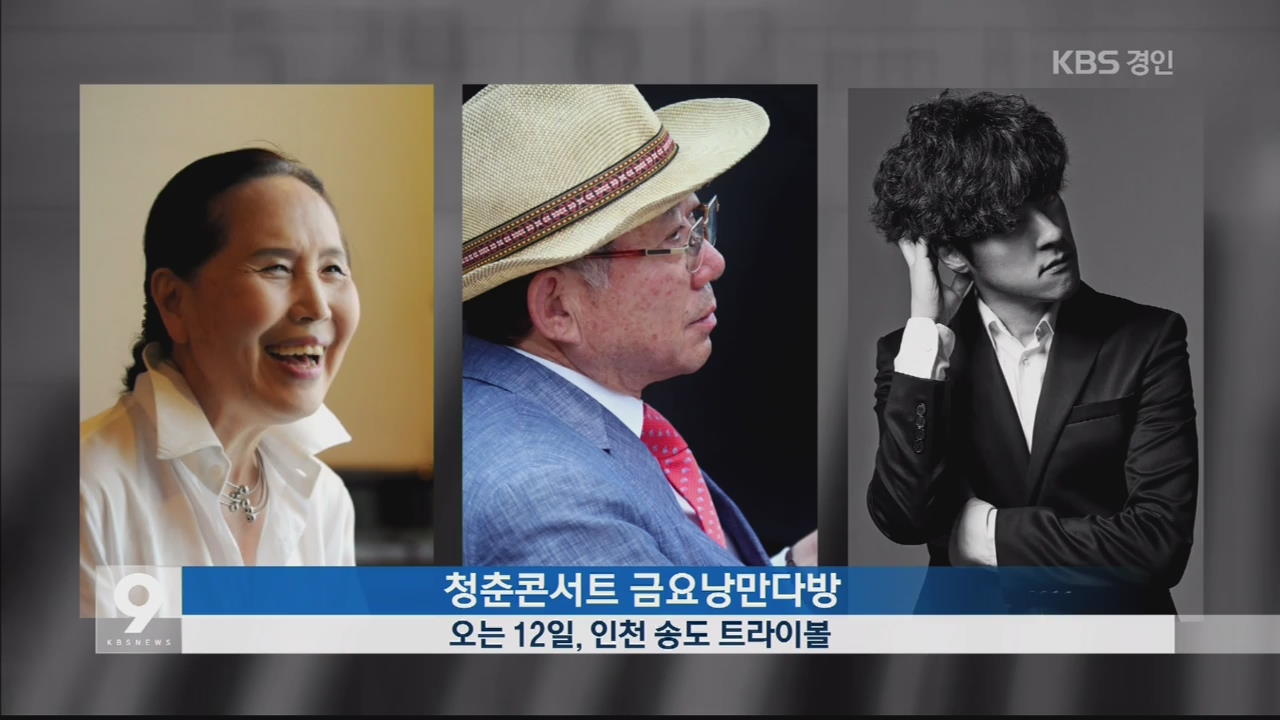


![[단독] 김건희 특검, ‘공천 개입’ 관련 김영선 전 의원 소환 통보…일정 조율 중](/data/news/2025/07/16/20250716_p7hDHF.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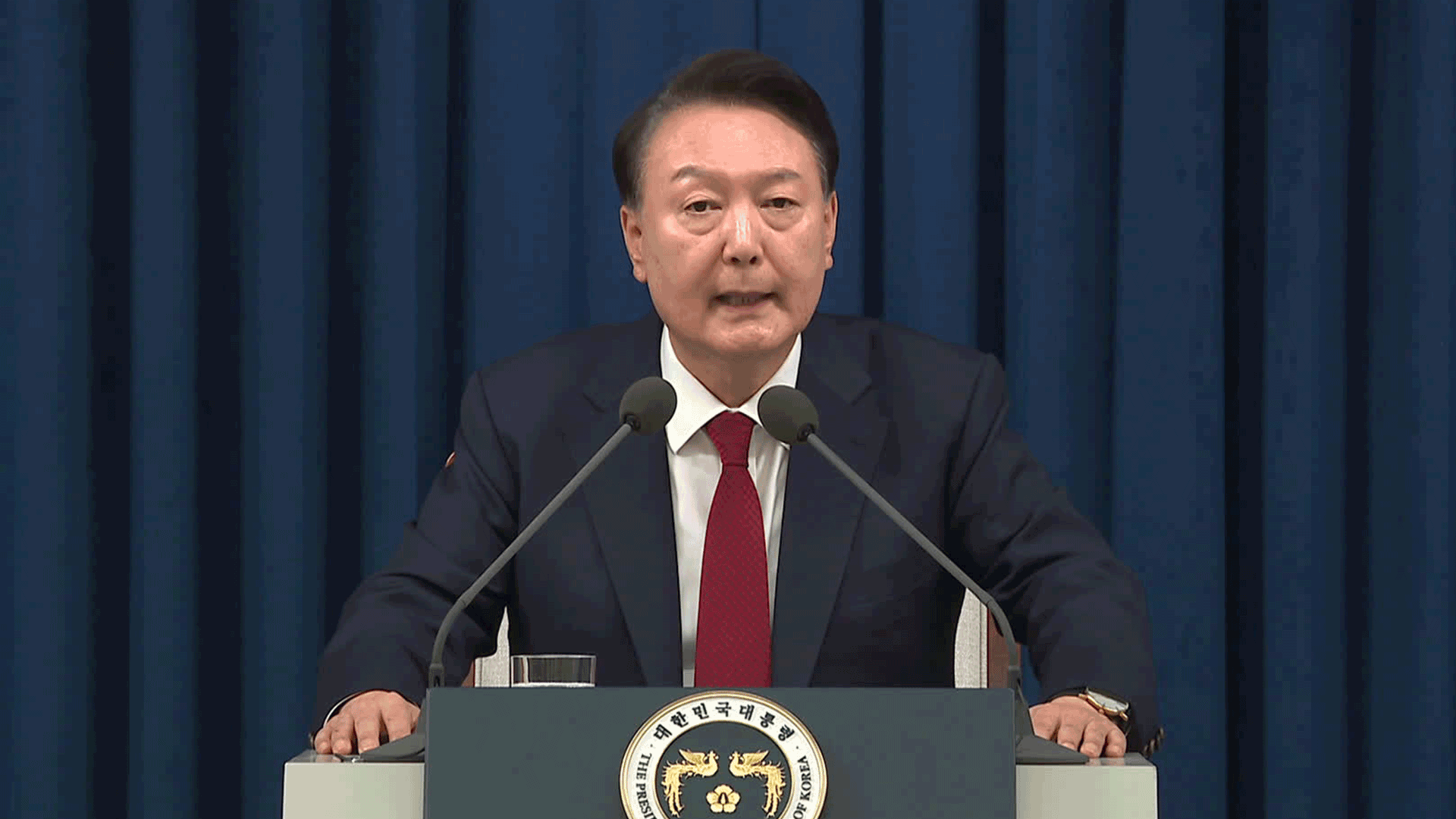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