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퍼] 서민 위한 전세임대, 열심히 일했더니…“나가라”
입력 2015.07.01 (19:06)
수정 2015.07.09 (11: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인간 다운 주거 기준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적정한 주거 기준' 정부 주거기본법의 핵심입니다. 지난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해 이르면 올해 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그동안 공급량에 초점을 맞췄던 정부 주거정책을 주거 복지 쪽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 법에서 '주거권'은 국민이 법에 따라 사회적인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부 핵심 정책 ‘서민 주택정책’
서민을 위한 주택 정책은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당장 올해도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이 연말까지 12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 종류도 많습니다. 공급대상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죠.
.jpg)
지난 2005년 시작해 지금까지 10년간 14만 가구가 입주했던 전세임대라는 게 있습니다. 전세임대는 도심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최저소득계층에게 현재 살고 있는 기존 주택에 정부가 전세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리해 주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장기간 재임대 해주는 겁니다. 전세임대는 선입주자를 정하고 후주택마련을 하는 절차로 수요자 취향에 맞는 주택을 선정해 지원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수도권에서 전세임대를 구하면 LH나 지자치단체에서 최고 750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5천 만원짜리 전세임대를 구하면 95%인 4750만 원을 LH 등이 지원해주고 세입자는 5%인 250만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4750만 원에 대해 월 2% 정도의 이자만 LH 등에 내면 됩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 9번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니까 최고 20년까지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 7500만 원, 광역시는 5500만 원, 그 외 지역은 4500만 원입니다. 파격적인 조건이죠.
.jpg)
■ 소득 찔끔 올랐더니…“나가라”
지난 2013년 10월부터 전세임대에 살던 대전에 사는 50대 가장 김 모 씨를 만났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시급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80살이 넘은 노모와 부인, 자식 2명 등 모두 5명이 85제곱미터, 방 3개짜리 전세임대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대전 변두리다 보니 전세 가격이 싸 그나마 5명이 살 만한 곳을 구한 겁니다. 2년이 지났으니까 10월에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지난해 일거리가 좀 늘어서 월급을 한달 15~20만 원 정도 더 받은 겁니다.
1년 소득이 180만 원에서 240만 원 정도 늘어난 거지요. 돈을 많이 벌었으니 좋아할 일이지만 한숨만 나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세임대의 기준 가운데 김 씨는 도시가계근로자 연평균 소득의 50% 이하 조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일거리가 많아지면서 소득이 200만 원 정도 늘다보니 도시가계근로자 연평균 소득을 2% 정도 넘은 겁니다. 단 2%요... 그래서 재계약 시점인 10월 달엔 당장 전세임대에서 나가야 합니다. 실제로 전세임대가 실시됐던 10년간 10년을 사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10년을 전세임대에서 살려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도시생활근로자 연평균 소득을 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 소득이 늘면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 지지부진한 제도 개선…서민 주거권 보호는?
국민임대 등 다른 임대 기준은 어떨까요? 전세임대를 제외하곤 모두 임대료 할증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살면서 소득이 좀 늘어도 그만큼 할증된 임대료를 내고 더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당장 "나가라" 하지는 않는 거지요. 이미 지난해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 때부터 이런 불합리한 점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지금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의 문제점을 포함해 임대 주택 정책을 다각도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을 바꾸는 문제다 보니 시행령은 시행령대로 규칙은 또 규칙대로 바꿔야 할 것이 많다는 거죠. 실제로 임대주택 정책은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왔습니다.
해마다 국정감사 때마다 많은 문제가 지적됐죠. 고급차를 타고 다니며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데도 법의 허점을 이용해 임대주택에서 돈 안들이고 사는 사람도 있죠. 이런 것들을 걸러내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반면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힘들게 얻은 주거권을 뺏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입니다. 간단합니다. 소득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각 임대주택간 조건을 동일하게 만들면 됩니다. 또 사는 동안 소득이 오르면 임대료를 더 많이 내게 하면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편법으로 임대주택에 사는 게 이로울 게 없게 만들면 되는 거죠. 잘 사는 사람이 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막아 세금 낭비를 덜고 정말 힘들게 사는 서민들에게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거권을 주는 것이 정부의 제대로 된 역할입니다.
[연관 기사]
☞ [뉴스9] 서민 위한 ‘전세임대’…소득 찔끔 늘었는데 “나가라”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적정한 주거 기준' 정부 주거기본법의 핵심입니다. 지난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해 이르면 올해 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그동안 공급량에 초점을 맞췄던 정부 주거정책을 주거 복지 쪽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 법에서 '주거권'은 국민이 법에 따라 사회적인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부 핵심 정책 ‘서민 주택정책’
서민을 위한 주택 정책은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당장 올해도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이 연말까지 12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 종류도 많습니다. 공급대상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죠.
.jpg)
지난 2005년 시작해 지금까지 10년간 14만 가구가 입주했던 전세임대라는 게 있습니다. 전세임대는 도심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최저소득계층에게 현재 살고 있는 기존 주택에 정부가 전세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리해 주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장기간 재임대 해주는 겁니다. 전세임대는 선입주자를 정하고 후주택마련을 하는 절차로 수요자 취향에 맞는 주택을 선정해 지원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수도권에서 전세임대를 구하면 LH나 지자치단체에서 최고 750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5천 만원짜리 전세임대를 구하면 95%인 4750만 원을 LH 등이 지원해주고 세입자는 5%인 250만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4750만 원에 대해 월 2% 정도의 이자만 LH 등에 내면 됩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 9번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니까 최고 20년까지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 7500만 원, 광역시는 5500만 원, 그 외 지역은 4500만 원입니다. 파격적인 조건이죠.
.jpg)
■ 소득 찔끔 올랐더니…“나가라”
지난 2013년 10월부터 전세임대에 살던 대전에 사는 50대 가장 김 모 씨를 만났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시급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80살이 넘은 노모와 부인, 자식 2명 등 모두 5명이 85제곱미터, 방 3개짜리 전세임대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대전 변두리다 보니 전세 가격이 싸 그나마 5명이 살 만한 곳을 구한 겁니다. 2년이 지났으니까 10월에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지난해 일거리가 좀 늘어서 월급을 한달 15~20만 원 정도 더 받은 겁니다.
1년 소득이 180만 원에서 240만 원 정도 늘어난 거지요. 돈을 많이 벌었으니 좋아할 일이지만 한숨만 나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세임대의 기준 가운데 김 씨는 도시가계근로자 연평균 소득의 50% 이하 조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일거리가 많아지면서 소득이 200만 원 정도 늘다보니 도시가계근로자 연평균 소득을 2% 정도 넘은 겁니다. 단 2%요... 그래서 재계약 시점인 10월 달엔 당장 전세임대에서 나가야 합니다. 실제로 전세임대가 실시됐던 10년간 10년을 사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10년을 전세임대에서 살려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도시생활근로자 연평균 소득을 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 소득이 늘면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 지지부진한 제도 개선…서민 주거권 보호는?
국민임대 등 다른 임대 기준은 어떨까요? 전세임대를 제외하곤 모두 임대료 할증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살면서 소득이 좀 늘어도 그만큼 할증된 임대료를 내고 더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당장 "나가라" 하지는 않는 거지요. 이미 지난해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 때부터 이런 불합리한 점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지금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의 문제점을 포함해 임대 주택 정책을 다각도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을 바꾸는 문제다 보니 시행령은 시행령대로 규칙은 또 규칙대로 바꿔야 할 것이 많다는 거죠. 실제로 임대주택 정책은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왔습니다.
해마다 국정감사 때마다 많은 문제가 지적됐죠. 고급차를 타고 다니며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데도 법의 허점을 이용해 임대주택에서 돈 안들이고 사는 사람도 있죠. 이런 것들을 걸러내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반면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힘들게 얻은 주거권을 뺏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입니다. 간단합니다. 소득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각 임대주택간 조건을 동일하게 만들면 됩니다. 또 사는 동안 소득이 오르면 임대료를 더 많이 내게 하면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편법으로 임대주택에 사는 게 이로울 게 없게 만들면 되는 거죠. 잘 사는 사람이 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막아 세금 낭비를 덜고 정말 힘들게 사는 서민들에게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거권을 주는 것이 정부의 제대로 된 역할입니다.
[연관 기사]
☞ [뉴스9] 서민 위한 ‘전세임대’…소득 찔끔 늘었는데 “나가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디·퍼] 서민 위한 전세임대, 열심히 일했더니…“나가라”
-
- 입력 2015-07-01 19:06:57
- 수정2015-07-09 11:39:46

■ 인간 다운 주거 기준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적정한 주거 기준' 정부 주거기본법의 핵심입니다. 지난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해 이르면 올해 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그동안 공급량에 초점을 맞췄던 정부 주거정책을 주거 복지 쪽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 법에서 '주거권'은 국민이 법에 따라 사회적인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부 핵심 정책 ‘서민 주택정책’
서민을 위한 주택 정책은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당장 올해도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이 연말까지 12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 종류도 많습니다. 공급대상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죠.
.jpg)
지난 2005년 시작해 지금까지 10년간 14만 가구가 입주했던 전세임대라는 게 있습니다. 전세임대는 도심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최저소득계층에게 현재 살고 있는 기존 주택에 정부가 전세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리해 주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장기간 재임대 해주는 겁니다. 전세임대는 선입주자를 정하고 후주택마련을 하는 절차로 수요자 취향에 맞는 주택을 선정해 지원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수도권에서 전세임대를 구하면 LH나 지자치단체에서 최고 750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5천 만원짜리 전세임대를 구하면 95%인 4750만 원을 LH 등이 지원해주고 세입자는 5%인 250만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4750만 원에 대해 월 2% 정도의 이자만 LH 등에 내면 됩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 9번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니까 최고 20년까지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 7500만 원, 광역시는 5500만 원, 그 외 지역은 4500만 원입니다. 파격적인 조건이죠.
.jpg)
■ 소득 찔끔 올랐더니…“나가라”
지난 2013년 10월부터 전세임대에 살던 대전에 사는 50대 가장 김 모 씨를 만났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시급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80살이 넘은 노모와 부인, 자식 2명 등 모두 5명이 85제곱미터, 방 3개짜리 전세임대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대전 변두리다 보니 전세 가격이 싸 그나마 5명이 살 만한 곳을 구한 겁니다. 2년이 지났으니까 10월에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지난해 일거리가 좀 늘어서 월급을 한달 15~20만 원 정도 더 받은 겁니다.
1년 소득이 180만 원에서 240만 원 정도 늘어난 거지요. 돈을 많이 벌었으니 좋아할 일이지만 한숨만 나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세임대의 기준 가운데 김 씨는 도시가계근로자 연평균 소득의 50% 이하 조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일거리가 많아지면서 소득이 200만 원 정도 늘다보니 도시가계근로자 연평균 소득을 2% 정도 넘은 겁니다. 단 2%요... 그래서 재계약 시점인 10월 달엔 당장 전세임대에서 나가야 합니다. 실제로 전세임대가 실시됐던 10년간 10년을 사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10년을 전세임대에서 살려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도시생활근로자 연평균 소득을 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 소득이 늘면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 지지부진한 제도 개선…서민 주거권 보호는?
국민임대 등 다른 임대 기준은 어떨까요? 전세임대를 제외하곤 모두 임대료 할증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살면서 소득이 좀 늘어도 그만큼 할증된 임대료를 내고 더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당장 "나가라" 하지는 않는 거지요. 이미 지난해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 때부터 이런 불합리한 점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지금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의 문제점을 포함해 임대 주택 정책을 다각도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을 바꾸는 문제다 보니 시행령은 시행령대로 규칙은 또 규칙대로 바꿔야 할 것이 많다는 거죠. 실제로 임대주택 정책은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왔습니다.
해마다 국정감사 때마다 많은 문제가 지적됐죠. 고급차를 타고 다니며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데도 법의 허점을 이용해 임대주택에서 돈 안들이고 사는 사람도 있죠. 이런 것들을 걸러내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반면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힘들게 얻은 주거권을 뺏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입니다. 간단합니다. 소득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각 임대주택간 조건을 동일하게 만들면 됩니다. 또 사는 동안 소득이 오르면 임대료를 더 많이 내게 하면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편법으로 임대주택에 사는 게 이로울 게 없게 만들면 되는 거죠. 잘 사는 사람이 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막아 세금 낭비를 덜고 정말 힘들게 사는 서민들에게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거권을 주는 것이 정부의 제대로 된 역할입니다.
[연관 기사]
☞ [뉴스9] 서민 위한 ‘전세임대’…소득 찔끔 늘었는데 “나가라”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적정한 주거 기준' 정부 주거기본법의 핵심입니다. 지난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해 이르면 올해 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그동안 공급량에 초점을 맞췄던 정부 주거정책을 주거 복지 쪽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 법에서 '주거권'은 국민이 법에 따라 사회적인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부 핵심 정책 ‘서민 주택정책’
서민을 위한 주택 정책은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당장 올해도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이 연말까지 12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 종류도 많습니다. 공급대상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죠.
.jpg)
지난 2005년 시작해 지금까지 10년간 14만 가구가 입주했던 전세임대라는 게 있습니다. 전세임대는 도심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최저소득계층에게 현재 살고 있는 기존 주택에 정부가 전세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리해 주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장기간 재임대 해주는 겁니다. 전세임대는 선입주자를 정하고 후주택마련을 하는 절차로 수요자 취향에 맞는 주택을 선정해 지원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수도권에서 전세임대를 구하면 LH나 지자치단체에서 최고 750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5천 만원짜리 전세임대를 구하면 95%인 4750만 원을 LH 등이 지원해주고 세입자는 5%인 250만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4750만 원에 대해 월 2% 정도의 이자만 LH 등에 내면 됩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 9번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니까 최고 20년까지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 7500만 원, 광역시는 5500만 원, 그 외 지역은 4500만 원입니다. 파격적인 조건이죠.
.jpg)
■ 소득 찔끔 올랐더니…“나가라”
지난 2013년 10월부터 전세임대에 살던 대전에 사는 50대 가장 김 모 씨를 만났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시급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80살이 넘은 노모와 부인, 자식 2명 등 모두 5명이 85제곱미터, 방 3개짜리 전세임대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대전 변두리다 보니 전세 가격이 싸 그나마 5명이 살 만한 곳을 구한 겁니다. 2년이 지났으니까 10월에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지난해 일거리가 좀 늘어서 월급을 한달 15~20만 원 정도 더 받은 겁니다.
1년 소득이 180만 원에서 240만 원 정도 늘어난 거지요. 돈을 많이 벌었으니 좋아할 일이지만 한숨만 나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세임대의 기준 가운데 김 씨는 도시가계근로자 연평균 소득의 50% 이하 조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일거리가 많아지면서 소득이 200만 원 정도 늘다보니 도시가계근로자 연평균 소득을 2% 정도 넘은 겁니다. 단 2%요... 그래서 재계약 시점인 10월 달엔 당장 전세임대에서 나가야 합니다. 실제로 전세임대가 실시됐던 10년간 10년을 사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10년을 전세임대에서 살려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도시생활근로자 연평균 소득을 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 소득이 늘면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 지지부진한 제도 개선…서민 주거권 보호는?
국민임대 등 다른 임대 기준은 어떨까요? 전세임대를 제외하곤 모두 임대료 할증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살면서 소득이 좀 늘어도 그만큼 할증된 임대료를 내고 더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당장 "나가라" 하지는 않는 거지요. 이미 지난해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 때부터 이런 불합리한 점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지금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의 문제점을 포함해 임대 주택 정책을 다각도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을 바꾸는 문제다 보니 시행령은 시행령대로 규칙은 또 규칙대로 바꿔야 할 것이 많다는 거죠. 실제로 임대주택 정책은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왔습니다.
해마다 국정감사 때마다 많은 문제가 지적됐죠. 고급차를 타고 다니며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데도 법의 허점을 이용해 임대주택에서 돈 안들이고 사는 사람도 있죠. 이런 것들을 걸러내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반면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힘들게 얻은 주거권을 뺏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입니다. 간단합니다. 소득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각 임대주택간 조건을 동일하게 만들면 됩니다. 또 사는 동안 소득이 오르면 임대료를 더 많이 내게 하면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편법으로 임대주택에 사는 게 이로울 게 없게 만들면 되는 거죠. 잘 사는 사람이 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막아 세금 낭비를 덜고 정말 힘들게 사는 서민들에게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거권을 주는 것이 정부의 제대로 된 역할입니다.
[연관 기사]
☞ [뉴스9] 서민 위한 ‘전세임대’…소득 찔끔 늘었는데 “나가라”
-
-

박현 기자 why@kbs.co.kr
박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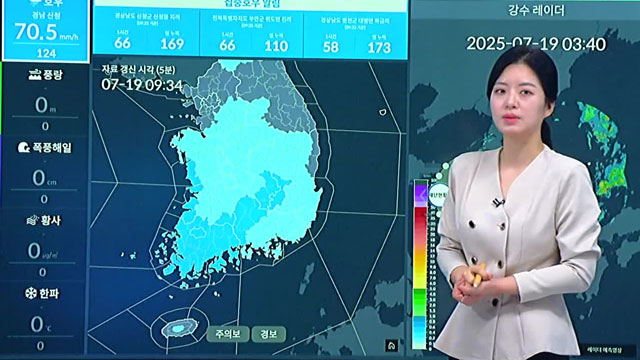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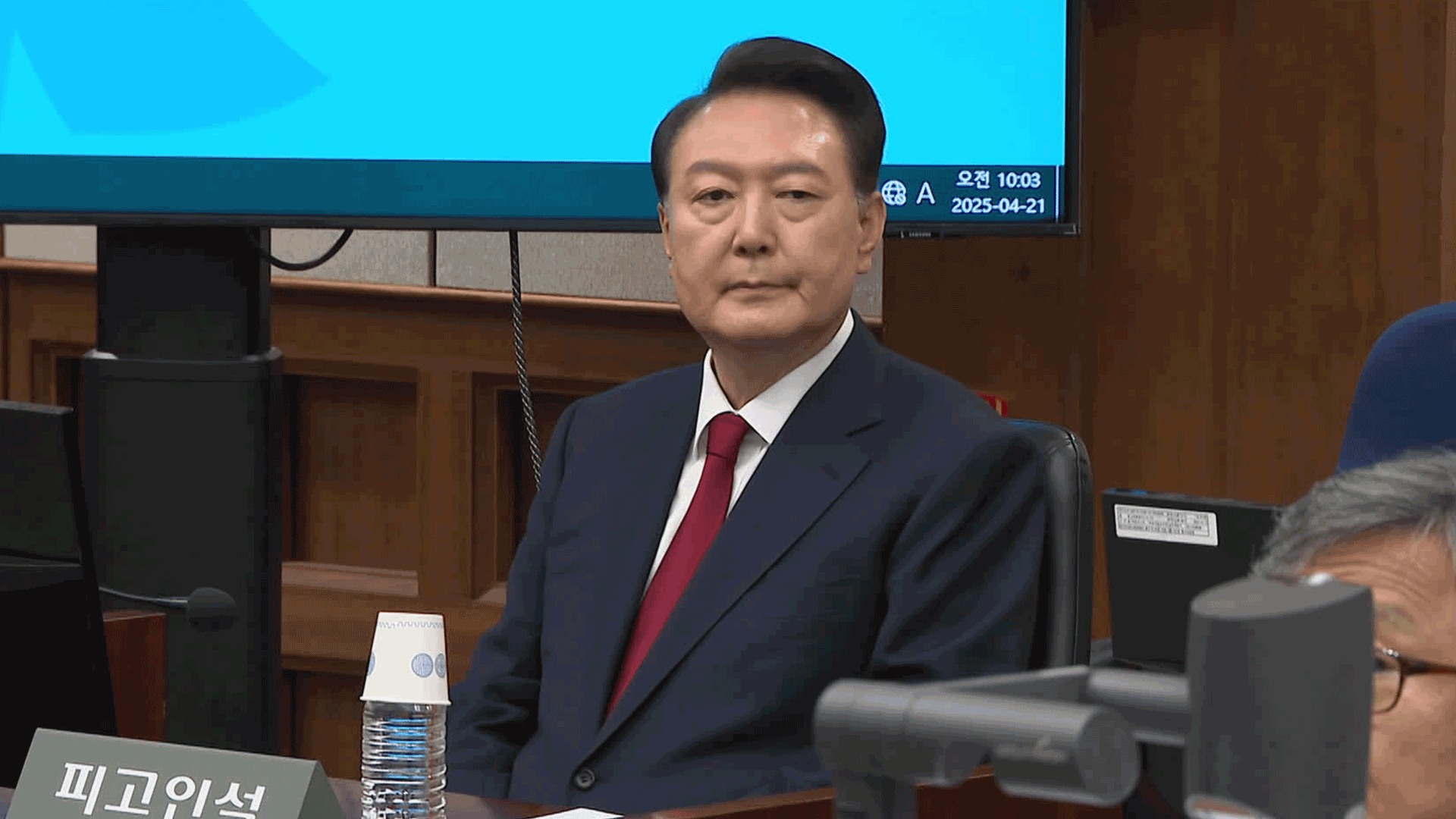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