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픈 목소리’ 롭슨, 41년만 마이크 놓는다
입력 2015.07.21 (10:27)
수정 2015.07.21 (11: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브리티시오픈 골프대회를 41년간 지켜온 정든 목소리가 올해를 끝으로 팬들과 작별했다.
해마다 브리티시오픈 1번 홀 시작 지점에서 마이크를 들고 선수들을 소개한 아이버 롭슨(69·영국)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1975년 대회에서 처음 마이크를 잡은 롭슨은 20일 끝난 제144회 브리티시오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선수 소개를 도맡아왔다.
'온 더 티(On the tee)'로 시작하는 그의 음성은 백발에 건장한 체구와 어울리지 않게 약간 높은 톤이고 억양도 특이해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영국 BBC는 "롭슨이 그동안 소개한 선수는 모두 1만8천995명"이라며 "20일 올해 최종 라운드 마지막 조의 아마추어 폴 던이 롭슨이 마지막으로 부른 이름"이라고 보도했다.
언뜻 보면 1번 티에서 선수 이름만 불러주면 되는 쉬운 일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컷이 추려지기 전인 1,2라운드에서는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4시 넘어까지 10여 분 간격으로 계속 선수들이 출발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식사를 할 시간도 없는 셈이다.
롭슨은 항상 첫 조가 출발하기 1시간30분 전에 자기 자리에 도착해서 그날 출전하는 선수들의 이름을 다 한 번씩 발음해보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는 자기 관리에도 철저했다. 미국 스포츠 전문매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SI)의 예전 보도 내용에 따르면 그는 경기 전날 저녁 7시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첫 조가 출발하고 나면 그는 자리도 뜨지 않고 커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고 자신의 일에만 충실했다고 한다. 나흘간 대회가 끝나고 나면 몸무게가 5㎏나 빠지기 일쑤였다.
롭슨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미국 골프채널과 인터뷰에서 "이번 대회가 그만두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했다"고 은퇴 시점을 잡은 이유를 설명했다.
'골프의 발상지'로 불리는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루스 골프장의 올드 코스에서 대회가 열리기 때문이었다.
그는 발음하기 어려웠던 선수로는 '피터 아카카시아카(Peter Akakasiaka)'라는 선수가 있었다고 회상했고 루이 우스트히즌(Oosthuizen)은 1970년대 '안드레스 우스트히즌'이라는 선수가 있어서 어렵지 않았다고 밝혔다.
20일 최종 라운드 마지막 조가 출발할 때 TV 중계 카메라는 3라운드까지 선두였던 우스트히즌, 던이 아닌 롭슨을 비춰주며 그의 41년간의 노고를 예우했다.
사실 그의 이름도 발음하기 쉬운 이름은 아니다.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닷컴은 '그의 이름(Ivor)은 발음을 '아이버(EYE-ver)'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이보'라고 부를 수도 있는 이름이라는 것이다.
해마다 브리티시오픈 1번 홀 시작 지점에서 마이크를 들고 선수들을 소개한 아이버 롭슨(69·영국)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1975년 대회에서 처음 마이크를 잡은 롭슨은 20일 끝난 제144회 브리티시오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선수 소개를 도맡아왔다.
'온 더 티(On the tee)'로 시작하는 그의 음성은 백발에 건장한 체구와 어울리지 않게 약간 높은 톤이고 억양도 특이해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영국 BBC는 "롭슨이 그동안 소개한 선수는 모두 1만8천995명"이라며 "20일 올해 최종 라운드 마지막 조의 아마추어 폴 던이 롭슨이 마지막으로 부른 이름"이라고 보도했다.
언뜻 보면 1번 티에서 선수 이름만 불러주면 되는 쉬운 일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컷이 추려지기 전인 1,2라운드에서는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4시 넘어까지 10여 분 간격으로 계속 선수들이 출발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식사를 할 시간도 없는 셈이다.
롭슨은 항상 첫 조가 출발하기 1시간30분 전에 자기 자리에 도착해서 그날 출전하는 선수들의 이름을 다 한 번씩 발음해보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는 자기 관리에도 철저했다. 미국 스포츠 전문매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SI)의 예전 보도 내용에 따르면 그는 경기 전날 저녁 7시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첫 조가 출발하고 나면 그는 자리도 뜨지 않고 커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고 자신의 일에만 충실했다고 한다. 나흘간 대회가 끝나고 나면 몸무게가 5㎏나 빠지기 일쑤였다.
롭슨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미국 골프채널과 인터뷰에서 "이번 대회가 그만두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했다"고 은퇴 시점을 잡은 이유를 설명했다.
'골프의 발상지'로 불리는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루스 골프장의 올드 코스에서 대회가 열리기 때문이었다.
그는 발음하기 어려웠던 선수로는 '피터 아카카시아카(Peter Akakasiaka)'라는 선수가 있었다고 회상했고 루이 우스트히즌(Oosthuizen)은 1970년대 '안드레스 우스트히즌'이라는 선수가 있어서 어렵지 않았다고 밝혔다.
20일 최종 라운드 마지막 조가 출발할 때 TV 중계 카메라는 3라운드까지 선두였던 우스트히즌, 던이 아닌 롭슨을 비춰주며 그의 41년간의 노고를 예우했다.
사실 그의 이름도 발음하기 쉬운 이름은 아니다.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닷컴은 '그의 이름(Ivor)은 발음을 '아이버(EYE-ver)'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이보'라고 부를 수도 있는 이름이라는 것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디오픈 목소리’ 롭슨, 41년만 마이크 놓는다
-
- 입력 2015-07-21 10:27:29
- 수정2015-07-21 11:44:25

브리티시오픈 골프대회를 41년간 지켜온 정든 목소리가 올해를 끝으로 팬들과 작별했다.
해마다 브리티시오픈 1번 홀 시작 지점에서 마이크를 들고 선수들을 소개한 아이버 롭슨(69·영국)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1975년 대회에서 처음 마이크를 잡은 롭슨은 20일 끝난 제144회 브리티시오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선수 소개를 도맡아왔다.
'온 더 티(On the tee)'로 시작하는 그의 음성은 백발에 건장한 체구와 어울리지 않게 약간 높은 톤이고 억양도 특이해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영국 BBC는 "롭슨이 그동안 소개한 선수는 모두 1만8천995명"이라며 "20일 올해 최종 라운드 마지막 조의 아마추어 폴 던이 롭슨이 마지막으로 부른 이름"이라고 보도했다.
언뜻 보면 1번 티에서 선수 이름만 불러주면 되는 쉬운 일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컷이 추려지기 전인 1,2라운드에서는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4시 넘어까지 10여 분 간격으로 계속 선수들이 출발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식사를 할 시간도 없는 셈이다.
롭슨은 항상 첫 조가 출발하기 1시간30분 전에 자기 자리에 도착해서 그날 출전하는 선수들의 이름을 다 한 번씩 발음해보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는 자기 관리에도 철저했다. 미국 스포츠 전문매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SI)의 예전 보도 내용에 따르면 그는 경기 전날 저녁 7시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첫 조가 출발하고 나면 그는 자리도 뜨지 않고 커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고 자신의 일에만 충실했다고 한다. 나흘간 대회가 끝나고 나면 몸무게가 5㎏나 빠지기 일쑤였다.
롭슨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미국 골프채널과 인터뷰에서 "이번 대회가 그만두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했다"고 은퇴 시점을 잡은 이유를 설명했다.
'골프의 발상지'로 불리는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루스 골프장의 올드 코스에서 대회가 열리기 때문이었다.
그는 발음하기 어려웠던 선수로는 '피터 아카카시아카(Peter Akakasiaka)'라는 선수가 있었다고 회상했고 루이 우스트히즌(Oosthuizen)은 1970년대 '안드레스 우스트히즌'이라는 선수가 있어서 어렵지 않았다고 밝혔다.
20일 최종 라운드 마지막 조가 출발할 때 TV 중계 카메라는 3라운드까지 선두였던 우스트히즌, 던이 아닌 롭슨을 비춰주며 그의 41년간의 노고를 예우했다.
사실 그의 이름도 발음하기 쉬운 이름은 아니다.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닷컴은 '그의 이름(Ivor)은 발음을 '아이버(EYE-ver)'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이보'라고 부를 수도 있는 이름이라는 것이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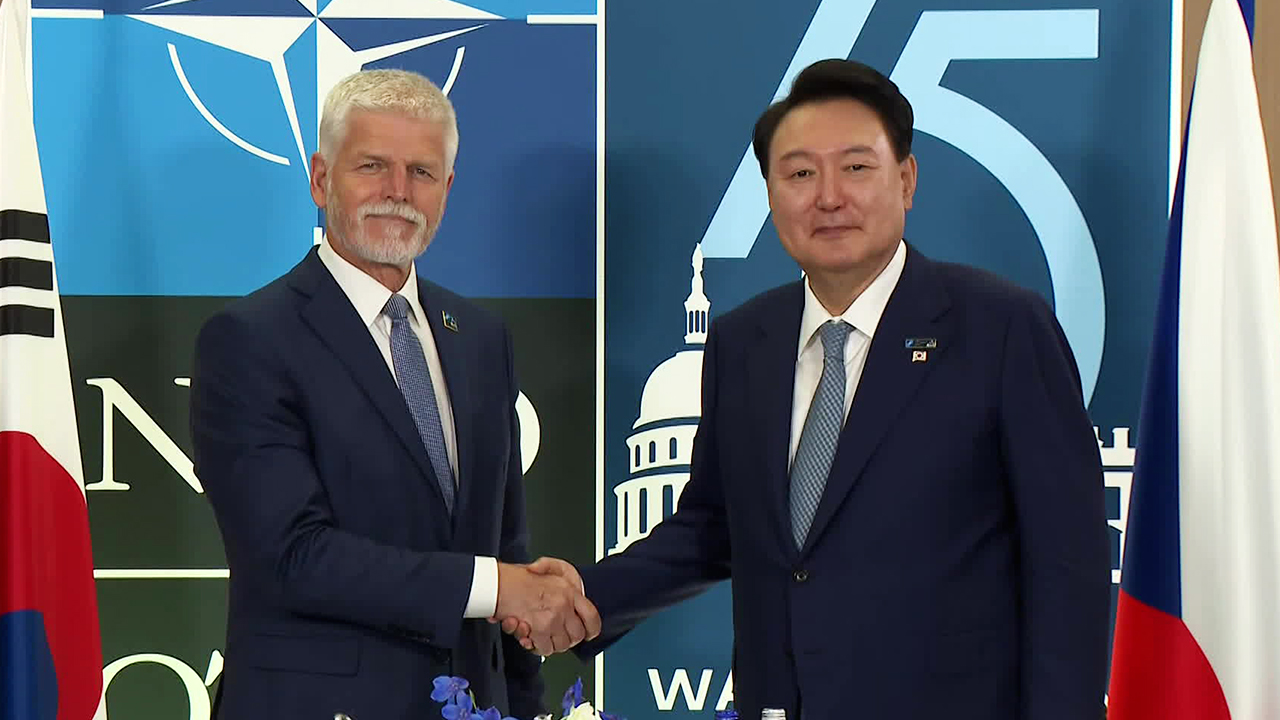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