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덕혜옹주'는 실존 인물인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의 삶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다큐멘터리가 아닌 극영화인 이상 허구의 가미는 불가피한 일.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한다. 사실(史實) 그대로 재현하려다 보면 영화의 재미가 떨어질 수 있고, 그렇다고 허구의 이야기를 많이 넣다 보면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덕혜옹주'를 연출한 허진호 감독은 6일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픽션의 개연성, 정당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며 이런 딜레마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드러냈다.
허 감독과 배급사 측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덕혜옹주의 일생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아 동명의 원작소설을 참고하되 영친왕 망명 시도와 같은 허구의 사건을 추가했다고 밝혀왔다.
그런데도 영화가 개봉한 후 '덕혜옹주가 언제 독립운동을 했느냐'며 덕혜옹주 미화 논란이 일고 있다.
극 중 덕혜옹주가 일제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라는 친일파 한택수(윤제문)의 요구를 여러 차례 거절하고 일본에 강제 징용된 조선인 노동자 앞에서 애국심을 고취하는 내용의 연설을 하거나 덕혜옹주가 조선 황실의 '마지막 자존심'으로 불리는 점은 이런 논란에 불씨를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
허 감독은 이에 대해 "덕혜옹주의 삶을 극화하면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었다"며 그중 하나로 "덕혜옹주가 독립운동가로 그려지는 것에 대한 경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덕혜옹주가 이방자 여사(영친왕 부인)가 일본어로 말을 걸었을 때는 잠자코 있다가 더듬더듬 한국말로 물어보니 그제야 대답했다는 자료가 있다"며 "당시 아버지 고종이 일제에 의해 독살됐다는 설이 퍼져 있어 덕혜옹주에게 반일 의식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영화 속 영친왕 망명 시도 역시 완전히 허구는 아니다. 영친왕의 형이자 고종의 5남인 의친왕 이강을 중국 상하이로 망명시키려 한 '대동강 사건'이 있었다. 당시 이강은 중국 단둥에서 일본 경찰에 붙잡혀 망명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다.
'덕혜옹주'는 허 감독이 8년 전 본 다큐멘터리에서 비롯됐다. 그는 이 다큐멘터리에서 덕혜옹주의 귀국 장면을 인상 깊게 보고서는 덕혜옹주의 일생을 영화로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한다.
덕혜옹주는 13살 때인 1925년 일본으로 강제 유학을 떠난 뒤 50살이 된 1962년에 비로소 고국 땅을 밟았다. 이승만 정부가 황족의 입국을 거부했기에 1945년 광복이 됐음에도 덕혜옹주는 17년이나 더 타국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37년 만의 귀국이었다. 일본으로 가기 전 총명하고 조선의 보물로 사랑받던 사람이 37년간 정략결혼을 하고 이혼하고,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딸은 자살하고…. 그럼에도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점이 감동적이었다."
허 감독은 덕혜옹주가 귀국하지 않았다면 그의 삶을 영화로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덕혜옹주가 귀국했을 때 그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덕혜옹주의 삶이 비극적이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판단해서다.
이 때문이었을까. 영화에서 덕혜옹주가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장면은 앞서 고조된 슬픈 감정이 폭발하면서 해소되는 하이라이트다.
허 감독은 "개인적으로 500년간 지속한 조선왕조가 어떻게 이렇게 끝날 수가 있나 싶었다. 조선왕조를 비호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귀국하고 싶어 했던 이들을 못 들어오게 한 것은 잘못 아닌가"라며 영화를 만든 데에는 관객들이 이런 역사적 사실에 관심을 가질 것을 바라는 마음도 담겨 있음을 전했다.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한다. 사실(史實) 그대로 재현하려다 보면 영화의 재미가 떨어질 수 있고, 그렇다고 허구의 이야기를 많이 넣다 보면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덕혜옹주'를 연출한 허진호 감독은 6일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픽션의 개연성, 정당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며 이런 딜레마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드러냈다.
허 감독과 배급사 측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덕혜옹주의 일생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아 동명의 원작소설을 참고하되 영친왕 망명 시도와 같은 허구의 사건을 추가했다고 밝혀왔다.
그런데도 영화가 개봉한 후 '덕혜옹주가 언제 독립운동을 했느냐'며 덕혜옹주 미화 논란이 일고 있다.
극 중 덕혜옹주가 일제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라는 친일파 한택수(윤제문)의 요구를 여러 차례 거절하고 일본에 강제 징용된 조선인 노동자 앞에서 애국심을 고취하는 내용의 연설을 하거나 덕혜옹주가 조선 황실의 '마지막 자존심'으로 불리는 점은 이런 논란에 불씨를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
허 감독은 이에 대해 "덕혜옹주의 삶을 극화하면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었다"며 그중 하나로 "덕혜옹주가 독립운동가로 그려지는 것에 대한 경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덕혜옹주가 이방자 여사(영친왕 부인)가 일본어로 말을 걸었을 때는 잠자코 있다가 더듬더듬 한국말로 물어보니 그제야 대답했다는 자료가 있다"며 "당시 아버지 고종이 일제에 의해 독살됐다는 설이 퍼져 있어 덕혜옹주에게 반일 의식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영화 속 영친왕 망명 시도 역시 완전히 허구는 아니다. 영친왕의 형이자 고종의 5남인 의친왕 이강을 중국 상하이로 망명시키려 한 '대동강 사건'이 있었다. 당시 이강은 중국 단둥에서 일본 경찰에 붙잡혀 망명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다.
'덕혜옹주'는 허 감독이 8년 전 본 다큐멘터리에서 비롯됐다. 그는 이 다큐멘터리에서 덕혜옹주의 귀국 장면을 인상 깊게 보고서는 덕혜옹주의 일생을 영화로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한다.
덕혜옹주는 13살 때인 1925년 일본으로 강제 유학을 떠난 뒤 50살이 된 1962년에 비로소 고국 땅을 밟았다. 이승만 정부가 황족의 입국을 거부했기에 1945년 광복이 됐음에도 덕혜옹주는 17년이나 더 타국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37년 만의 귀국이었다. 일본으로 가기 전 총명하고 조선의 보물로 사랑받던 사람이 37년간 정략결혼을 하고 이혼하고,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딸은 자살하고…. 그럼에도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점이 감동적이었다."
허 감독은 덕혜옹주가 귀국하지 않았다면 그의 삶을 영화로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덕혜옹주가 귀국했을 때 그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덕혜옹주의 삶이 비극적이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판단해서다.
이 때문이었을까. 영화에서 덕혜옹주가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장면은 앞서 고조된 슬픈 감정이 폭발하면서 해소되는 하이라이트다.
허 감독은 "개인적으로 500년간 지속한 조선왕조가 어떻게 이렇게 끝날 수가 있나 싶었다. 조선왕조를 비호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귀국하고 싶어 했던 이들을 못 들어오게 한 것은 잘못 아닌가"라며 영화를 만든 데에는 관객들이 이런 역사적 사실에 관심을 가질 것을 바라는 마음도 담겨 있음을 전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덕혜옹주’ 허진호 감독 “픽션의 개연성 고민 많았다”
-
- 입력 2016-08-06 11:11:46

영화 '덕혜옹주'는 실존 인물인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의 삶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다큐멘터리가 아닌 극영화인 이상 허구의 가미는 불가피한 일.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한다. 사실(史實) 그대로 재현하려다 보면 영화의 재미가 떨어질 수 있고, 그렇다고 허구의 이야기를 많이 넣다 보면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덕혜옹주'를 연출한 허진호 감독은 6일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픽션의 개연성, 정당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며 이런 딜레마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드러냈다.
허 감독과 배급사 측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덕혜옹주의 일생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아 동명의 원작소설을 참고하되 영친왕 망명 시도와 같은 허구의 사건을 추가했다고 밝혀왔다.
그런데도 영화가 개봉한 후 '덕혜옹주가 언제 독립운동을 했느냐'며 덕혜옹주 미화 논란이 일고 있다.
극 중 덕혜옹주가 일제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라는 친일파 한택수(윤제문)의 요구를 여러 차례 거절하고 일본에 강제 징용된 조선인 노동자 앞에서 애국심을 고취하는 내용의 연설을 하거나 덕혜옹주가 조선 황실의 '마지막 자존심'으로 불리는 점은 이런 논란에 불씨를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
허 감독은 이에 대해 "덕혜옹주의 삶을 극화하면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었다"며 그중 하나로 "덕혜옹주가 독립운동가로 그려지는 것에 대한 경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덕혜옹주가 이방자 여사(영친왕 부인)가 일본어로 말을 걸었을 때는 잠자코 있다가 더듬더듬 한국말로 물어보니 그제야 대답했다는 자료가 있다"며 "당시 아버지 고종이 일제에 의해 독살됐다는 설이 퍼져 있어 덕혜옹주에게 반일 의식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영화 속 영친왕 망명 시도 역시 완전히 허구는 아니다. 영친왕의 형이자 고종의 5남인 의친왕 이강을 중국 상하이로 망명시키려 한 '대동강 사건'이 있었다. 당시 이강은 중국 단둥에서 일본 경찰에 붙잡혀 망명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다.
'덕혜옹주'는 허 감독이 8년 전 본 다큐멘터리에서 비롯됐다. 그는 이 다큐멘터리에서 덕혜옹주의 귀국 장면을 인상 깊게 보고서는 덕혜옹주의 일생을 영화로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한다.
덕혜옹주는 13살 때인 1925년 일본으로 강제 유학을 떠난 뒤 50살이 된 1962년에 비로소 고국 땅을 밟았다. 이승만 정부가 황족의 입국을 거부했기에 1945년 광복이 됐음에도 덕혜옹주는 17년이나 더 타국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37년 만의 귀국이었다. 일본으로 가기 전 총명하고 조선의 보물로 사랑받던 사람이 37년간 정략결혼을 하고 이혼하고,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딸은 자살하고…. 그럼에도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점이 감동적이었다."
허 감독은 덕혜옹주가 귀국하지 않았다면 그의 삶을 영화로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덕혜옹주가 귀국했을 때 그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덕혜옹주의 삶이 비극적이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판단해서다.
이 때문이었을까. 영화에서 덕혜옹주가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장면은 앞서 고조된 슬픈 감정이 폭발하면서 해소되는 하이라이트다.
허 감독은 "개인적으로 500년간 지속한 조선왕조가 어떻게 이렇게 끝날 수가 있나 싶었다. 조선왕조를 비호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귀국하고 싶어 했던 이들을 못 들어오게 한 것은 잘못 아닌가"라며 영화를 만든 데에는 관객들이 이런 역사적 사실에 관심을 가질 것을 바라는 마음도 담겨 있음을 전했다.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한다. 사실(史實) 그대로 재현하려다 보면 영화의 재미가 떨어질 수 있고, 그렇다고 허구의 이야기를 많이 넣다 보면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덕혜옹주'를 연출한 허진호 감독은 6일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픽션의 개연성, 정당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며 이런 딜레마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드러냈다.
허 감독과 배급사 측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덕혜옹주의 일생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아 동명의 원작소설을 참고하되 영친왕 망명 시도와 같은 허구의 사건을 추가했다고 밝혀왔다.
그런데도 영화가 개봉한 후 '덕혜옹주가 언제 독립운동을 했느냐'며 덕혜옹주 미화 논란이 일고 있다.
극 중 덕혜옹주가 일제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라는 친일파 한택수(윤제문)의 요구를 여러 차례 거절하고 일본에 강제 징용된 조선인 노동자 앞에서 애국심을 고취하는 내용의 연설을 하거나 덕혜옹주가 조선 황실의 '마지막 자존심'으로 불리는 점은 이런 논란에 불씨를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
허 감독은 이에 대해 "덕혜옹주의 삶을 극화하면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었다"며 그중 하나로 "덕혜옹주가 독립운동가로 그려지는 것에 대한 경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덕혜옹주가 이방자 여사(영친왕 부인)가 일본어로 말을 걸었을 때는 잠자코 있다가 더듬더듬 한국말로 물어보니 그제야 대답했다는 자료가 있다"며 "당시 아버지 고종이 일제에 의해 독살됐다는 설이 퍼져 있어 덕혜옹주에게 반일 의식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영화 속 영친왕 망명 시도 역시 완전히 허구는 아니다. 영친왕의 형이자 고종의 5남인 의친왕 이강을 중국 상하이로 망명시키려 한 '대동강 사건'이 있었다. 당시 이강은 중국 단둥에서 일본 경찰에 붙잡혀 망명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다.
'덕혜옹주'는 허 감독이 8년 전 본 다큐멘터리에서 비롯됐다. 그는 이 다큐멘터리에서 덕혜옹주의 귀국 장면을 인상 깊게 보고서는 덕혜옹주의 일생을 영화로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한다.
덕혜옹주는 13살 때인 1925년 일본으로 강제 유학을 떠난 뒤 50살이 된 1962년에 비로소 고국 땅을 밟았다. 이승만 정부가 황족의 입국을 거부했기에 1945년 광복이 됐음에도 덕혜옹주는 17년이나 더 타국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37년 만의 귀국이었다. 일본으로 가기 전 총명하고 조선의 보물로 사랑받던 사람이 37년간 정략결혼을 하고 이혼하고,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딸은 자살하고…. 그럼에도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점이 감동적이었다."
허 감독은 덕혜옹주가 귀국하지 않았다면 그의 삶을 영화로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덕혜옹주가 귀국했을 때 그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덕혜옹주의 삶이 비극적이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판단해서다.
이 때문이었을까. 영화에서 덕혜옹주가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장면은 앞서 고조된 슬픈 감정이 폭발하면서 해소되는 하이라이트다.
허 감독은 "개인적으로 500년간 지속한 조선왕조가 어떻게 이렇게 끝날 수가 있나 싶었다. 조선왕조를 비호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귀국하고 싶어 했던 이들을 못 들어오게 한 것은 잘못 아닌가"라며 영화를 만든 데에는 관객들이 이런 역사적 사실에 관심을 가질 것을 바라는 마음도 담겨 있음을 전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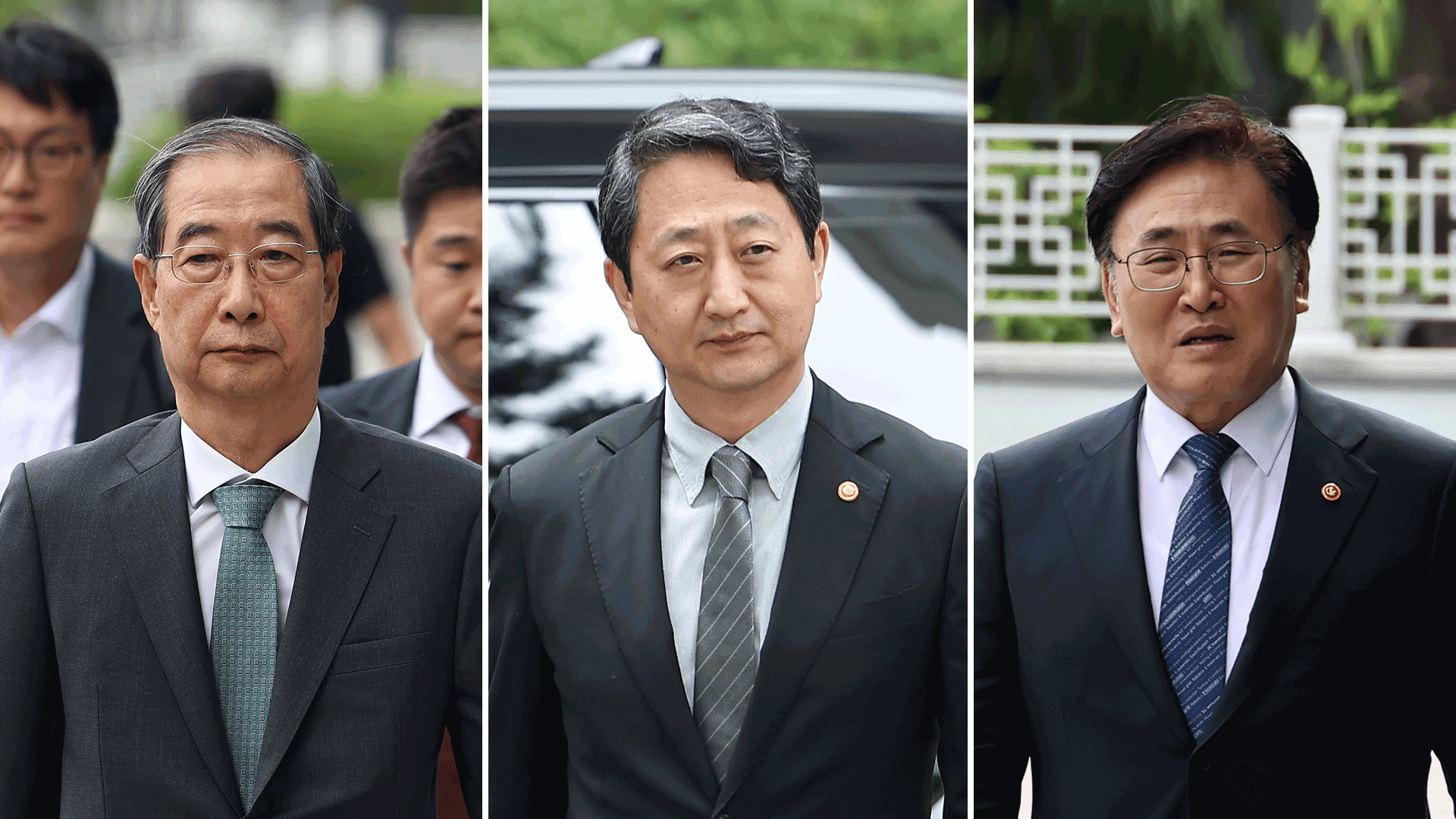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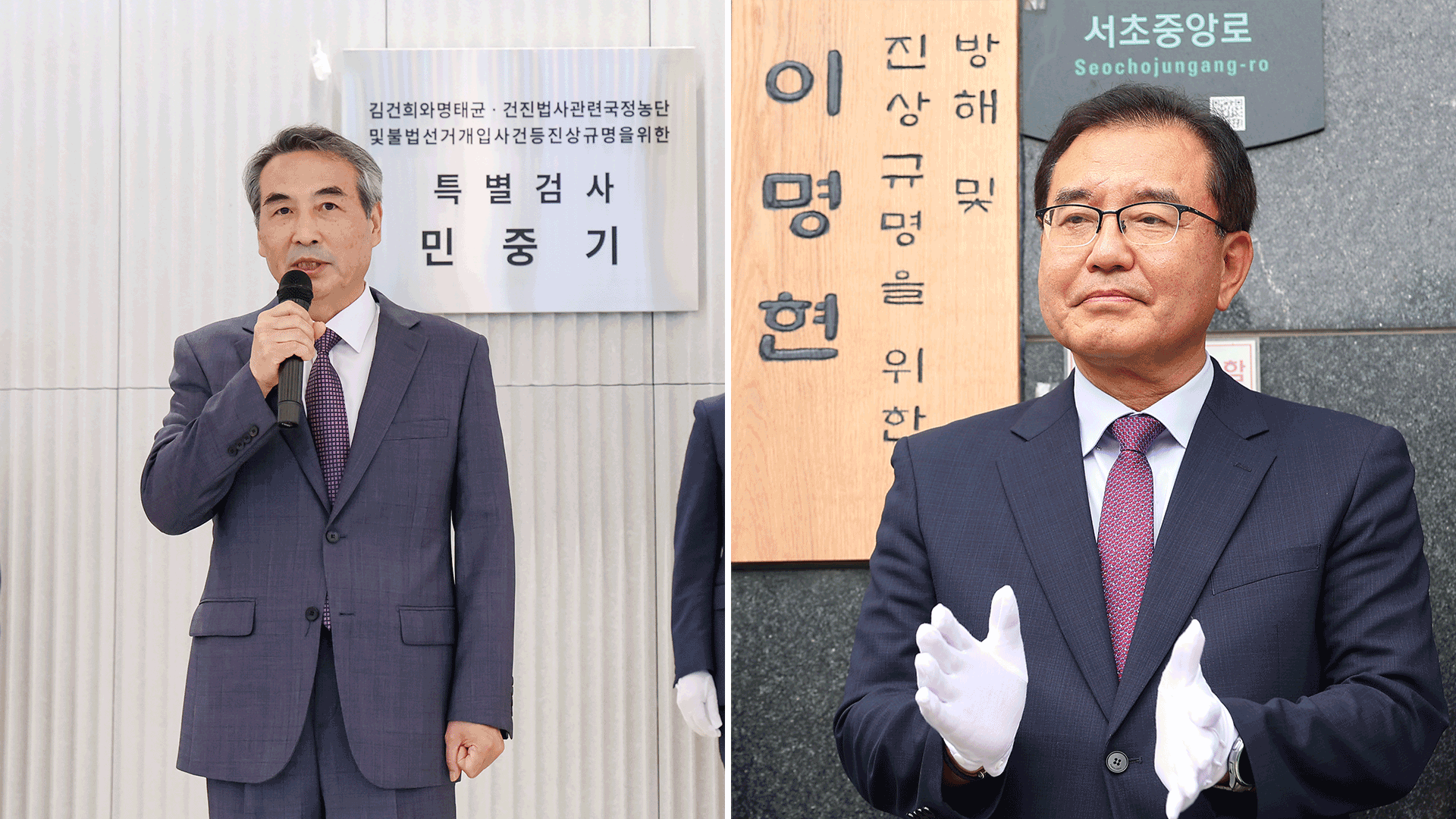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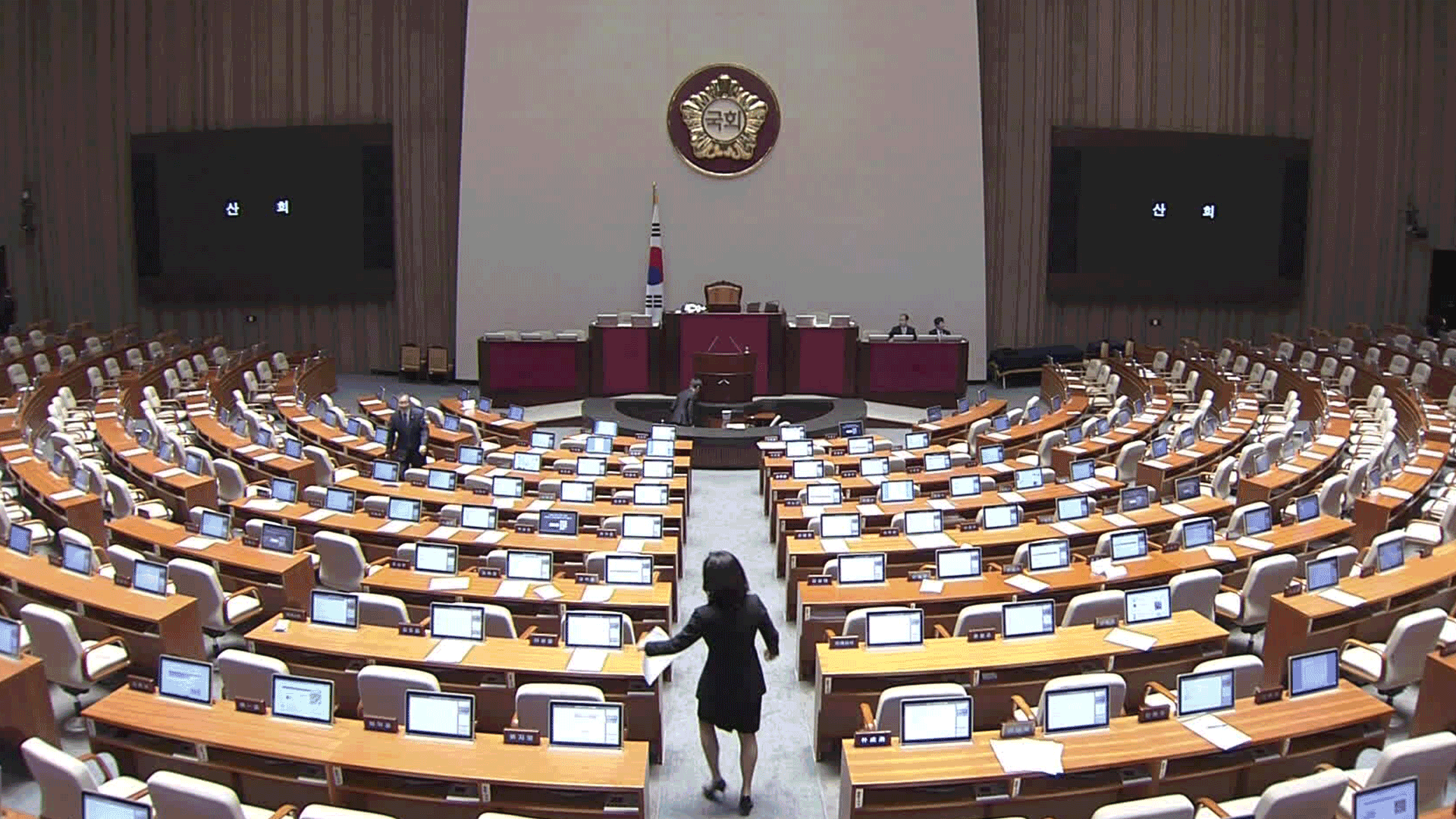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