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목포에서 배를 타고 3시간 넘게 달리면, 흑산면에 딸린 섬 대둔도에 도착한다.
모터가 달린 배가 익숙한 시대지만 아직 나무배를 노 저으며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86세 박복탑 할머니가 있다. '복탑'이라는 이름은 '복이 탑처럼 쌓이라'는 의미로, 친정엄마가 지어줬다고 한다.
하지만 할머니는 "복이 아니라 고생만 탑처럼 쌓고 살았다"라고 푸념한다. 인생 말년이 되어서야 돌아보니 그 고생도 행복이었다고 말하는 할머니.
오늘도 100년 넘은 낡은 뗏마배를 저어 바다로 향하는 박복탑 할머니의 인생을 만나본다.
대둔도의 이모, 박복탑

대둔도 토박이 박복탑 할머니의 인생을 듣다 보면 그야말로 소설 한 권으로는 부족할 정도이다. 할머니는 1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5살 때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난 후 어린 두 동생의 엄마로 살았다.
박복탑 할머니는 동생들 다 키워 시집을 보낸 후, 가난하지만 착한 남자를 만나 26살에 가정을 꾸렸다. 박복한 인생 탓일까. 결혼한 지 3년 만에 남편과도 사별했다. 그 후, 할머니는 안 해 본 일이 없을 정도로 억척같이 살아왔다.
그렇게 힘겨운 인생을 살아온 동안 할머니의 가슴엔 체기가 쌓이고 쌓여 석회처럼 굳어 버렸다. 그래서인지 할머니는 인생의 답답함이 느껴질 때 한 잔의 탄산음료로 위로를 받곤 한다.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지금 '허허허'하고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또 있다. 친구이자, 조카 같은 섬마을 주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뗏마배가 내 자가용이여"

처녀 때부터 노를 저어온 박복탑 할머니는 일생을 바다에 기대고 살았다. 꽃다운 나이의 복탑 할머니에게 바다는 답답하고 벗어나고 싶은 구속이기도 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바다가 있어 가난을 벗어날 수 있었고, 그 바다가 있어 지금도 웃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한때는 밉고 미워 원망스레 된소리를 하게 됐던 바다. 그러나 조용히 할머니의 하소연을 들어주며 위로해 주는 것 또한 바다였다. 그래서 할머니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무배를 저으며 바다로 나간다.
100살 먹은 낡은 나무배이지만, 세상 그 어떤 자가용보다 자랑스럽다는 할머니의 뗏마배 사랑이 느껴진다. 할머니에게 뗏마배는 삶의 산증인이자, 함께 늙어가는 친구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지런한 마을이어라"

한적하고 고즈넉한 섬마을에서 가가호호 합쳐봐야 마을 주민들은 몇십 명도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의 낮 마실 풍경은 항상 조용하다. 이유는 언제나 일터인 바다에서 부지런하게 일하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이다.
마을 어르신들은 새벽부터 미역이며 톳을 채취하고, 전복과 우럭을 키우는 가두리 양식으로 쉴새 없이 바쁘다. 육지에서는 이름도 낯선 섬이지만, 어장에 자원이 풍부하고 바다가 내어주는 먹거리가 넘쳐나니 '부자섬'으로 불리기도 한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 했던가. '돈주머니 실밥 터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라는 대둔도는 낯선 이방인들의 방문에도 인심 또한 넉넉하다. 외지 사람들에게도 기꺼이 바다 한상차림을 내어준다. 돈만큼이나 인심 또한 부자인 셈이다.
그래서 대둔도는 비옥한 어부의 땅이자 넉넉하게 내어주는 인정이 넘치는 섬이다.

자세한 내용은 6월 10일(토) 저녁 7시 10분 KBS 1TV '다큐 공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프로덕션2] 문경림 kbs.petitlim@kbs.co.kr
모터가 달린 배가 익숙한 시대지만 아직 나무배를 노 저으며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86세 박복탑 할머니가 있다. '복탑'이라는 이름은 '복이 탑처럼 쌓이라'는 의미로, 친정엄마가 지어줬다고 한다.
하지만 할머니는 "복이 아니라 고생만 탑처럼 쌓고 살았다"라고 푸념한다. 인생 말년이 되어서야 돌아보니 그 고생도 행복이었다고 말하는 할머니.
오늘도 100년 넘은 낡은 뗏마배를 저어 바다로 향하는 박복탑 할머니의 인생을 만나본다.
대둔도의 이모, 박복탑

대둔도 토박이 박복탑 할머니의 인생을 듣다 보면 그야말로 소설 한 권으로는 부족할 정도이다. 할머니는 1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5살 때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난 후 어린 두 동생의 엄마로 살았다.
박복탑 할머니는 동생들 다 키워 시집을 보낸 후, 가난하지만 착한 남자를 만나 26살에 가정을 꾸렸다. 박복한 인생 탓일까. 결혼한 지 3년 만에 남편과도 사별했다. 그 후, 할머니는 안 해 본 일이 없을 정도로 억척같이 살아왔다.
그렇게 힘겨운 인생을 살아온 동안 할머니의 가슴엔 체기가 쌓이고 쌓여 석회처럼 굳어 버렸다. 그래서인지 할머니는 인생의 답답함이 느껴질 때 한 잔의 탄산음료로 위로를 받곤 한다.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지금 '허허허'하고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또 있다. 친구이자, 조카 같은 섬마을 주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뗏마배가 내 자가용이여"

처녀 때부터 노를 저어온 박복탑 할머니는 일생을 바다에 기대고 살았다. 꽃다운 나이의 복탑 할머니에게 바다는 답답하고 벗어나고 싶은 구속이기도 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바다가 있어 가난을 벗어날 수 있었고, 그 바다가 있어 지금도 웃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한때는 밉고 미워 원망스레 된소리를 하게 됐던 바다. 그러나 조용히 할머니의 하소연을 들어주며 위로해 주는 것 또한 바다였다. 그래서 할머니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무배를 저으며 바다로 나간다.
100살 먹은 낡은 나무배이지만, 세상 그 어떤 자가용보다 자랑스럽다는 할머니의 뗏마배 사랑이 느껴진다. 할머니에게 뗏마배는 삶의 산증인이자, 함께 늙어가는 친구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지런한 마을이어라"

한적하고 고즈넉한 섬마을에서 가가호호 합쳐봐야 마을 주민들은 몇십 명도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의 낮 마실 풍경은 항상 조용하다. 이유는 언제나 일터인 바다에서 부지런하게 일하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이다.
마을 어르신들은 새벽부터 미역이며 톳을 채취하고, 전복과 우럭을 키우는 가두리 양식으로 쉴새 없이 바쁘다. 육지에서는 이름도 낯선 섬이지만, 어장에 자원이 풍부하고 바다가 내어주는 먹거리가 넘쳐나니 '부자섬'으로 불리기도 한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 했던가. '돈주머니 실밥 터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라는 대둔도는 낯선 이방인들의 방문에도 인심 또한 넉넉하다. 외지 사람들에게도 기꺼이 바다 한상차림을 내어준다. 돈만큼이나 인심 또한 부자인 셈이다.
그래서 대둔도는 비옥한 어부의 땅이자 넉넉하게 내어주는 인정이 넘치는 섬이다.

자세한 내용은 6월 10일(토) 저녁 7시 10분 KBS 1TV '다큐 공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프로덕션2] 문경림 kbs.petitlim@kbs.co.kr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00년 된 뗏마배가 내 자가용이여”…‘대둔도’ 할미 이야기
-
- 입력 2017-06-08 10:41:17

전라남도 목포에서 배를 타고 3시간 넘게 달리면, 흑산면에 딸린 섬 대둔도에 도착한다.
모터가 달린 배가 익숙한 시대지만 아직 나무배를 노 저으며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86세 박복탑 할머니가 있다. '복탑'이라는 이름은 '복이 탑처럼 쌓이라'는 의미로, 친정엄마가 지어줬다고 한다.
하지만 할머니는 "복이 아니라 고생만 탑처럼 쌓고 살았다"라고 푸념한다. 인생 말년이 되어서야 돌아보니 그 고생도 행복이었다고 말하는 할머니.
오늘도 100년 넘은 낡은 뗏마배를 저어 바다로 향하는 박복탑 할머니의 인생을 만나본다.
대둔도의 이모, 박복탑

대둔도 토박이 박복탑 할머니의 인생을 듣다 보면 그야말로 소설 한 권으로는 부족할 정도이다. 할머니는 1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5살 때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난 후 어린 두 동생의 엄마로 살았다.
박복탑 할머니는 동생들 다 키워 시집을 보낸 후, 가난하지만 착한 남자를 만나 26살에 가정을 꾸렸다. 박복한 인생 탓일까. 결혼한 지 3년 만에 남편과도 사별했다. 그 후, 할머니는 안 해 본 일이 없을 정도로 억척같이 살아왔다.
그렇게 힘겨운 인생을 살아온 동안 할머니의 가슴엔 체기가 쌓이고 쌓여 석회처럼 굳어 버렸다. 그래서인지 할머니는 인생의 답답함이 느껴질 때 한 잔의 탄산음료로 위로를 받곤 한다.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지금 '허허허'하고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또 있다. 친구이자, 조카 같은 섬마을 주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뗏마배가 내 자가용이여"

처녀 때부터 노를 저어온 박복탑 할머니는 일생을 바다에 기대고 살았다. 꽃다운 나이의 복탑 할머니에게 바다는 답답하고 벗어나고 싶은 구속이기도 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바다가 있어 가난을 벗어날 수 있었고, 그 바다가 있어 지금도 웃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한때는 밉고 미워 원망스레 된소리를 하게 됐던 바다. 그러나 조용히 할머니의 하소연을 들어주며 위로해 주는 것 또한 바다였다. 그래서 할머니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무배를 저으며 바다로 나간다.
100살 먹은 낡은 나무배이지만, 세상 그 어떤 자가용보다 자랑스럽다는 할머니의 뗏마배 사랑이 느껴진다. 할머니에게 뗏마배는 삶의 산증인이자, 함께 늙어가는 친구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지런한 마을이어라"

한적하고 고즈넉한 섬마을에서 가가호호 합쳐봐야 마을 주민들은 몇십 명도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의 낮 마실 풍경은 항상 조용하다. 이유는 언제나 일터인 바다에서 부지런하게 일하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이다.
마을 어르신들은 새벽부터 미역이며 톳을 채취하고, 전복과 우럭을 키우는 가두리 양식으로 쉴새 없이 바쁘다. 육지에서는 이름도 낯선 섬이지만, 어장에 자원이 풍부하고 바다가 내어주는 먹거리가 넘쳐나니 '부자섬'으로 불리기도 한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 했던가. '돈주머니 실밥 터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라는 대둔도는 낯선 이방인들의 방문에도 인심 또한 넉넉하다. 외지 사람들에게도 기꺼이 바다 한상차림을 내어준다. 돈만큼이나 인심 또한 부자인 셈이다.
그래서 대둔도는 비옥한 어부의 땅이자 넉넉하게 내어주는 인정이 넘치는 섬이다.

자세한 내용은 6월 10일(토) 저녁 7시 10분 KBS 1TV '다큐 공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프로덕션2] 문경림 kbs.petitlim@kbs.co.kr
모터가 달린 배가 익숙한 시대지만 아직 나무배를 노 저으며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86세 박복탑 할머니가 있다. '복탑'이라는 이름은 '복이 탑처럼 쌓이라'는 의미로, 친정엄마가 지어줬다고 한다.
하지만 할머니는 "복이 아니라 고생만 탑처럼 쌓고 살았다"라고 푸념한다. 인생 말년이 되어서야 돌아보니 그 고생도 행복이었다고 말하는 할머니.
오늘도 100년 넘은 낡은 뗏마배를 저어 바다로 향하는 박복탑 할머니의 인생을 만나본다.
대둔도의 이모, 박복탑

대둔도 토박이 박복탑 할머니의 인생을 듣다 보면 그야말로 소설 한 권으로는 부족할 정도이다. 할머니는 1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5살 때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난 후 어린 두 동생의 엄마로 살았다.
박복탑 할머니는 동생들 다 키워 시집을 보낸 후, 가난하지만 착한 남자를 만나 26살에 가정을 꾸렸다. 박복한 인생 탓일까. 결혼한 지 3년 만에 남편과도 사별했다. 그 후, 할머니는 안 해 본 일이 없을 정도로 억척같이 살아왔다.
그렇게 힘겨운 인생을 살아온 동안 할머니의 가슴엔 체기가 쌓이고 쌓여 석회처럼 굳어 버렸다. 그래서인지 할머니는 인생의 답답함이 느껴질 때 한 잔의 탄산음료로 위로를 받곤 한다.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지금 '허허허'하고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또 있다. 친구이자, 조카 같은 섬마을 주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뗏마배가 내 자가용이여"

처녀 때부터 노를 저어온 박복탑 할머니는 일생을 바다에 기대고 살았다. 꽃다운 나이의 복탑 할머니에게 바다는 답답하고 벗어나고 싶은 구속이기도 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바다가 있어 가난을 벗어날 수 있었고, 그 바다가 있어 지금도 웃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한때는 밉고 미워 원망스레 된소리를 하게 됐던 바다. 그러나 조용히 할머니의 하소연을 들어주며 위로해 주는 것 또한 바다였다. 그래서 할머니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무배를 저으며 바다로 나간다.
100살 먹은 낡은 나무배이지만, 세상 그 어떤 자가용보다 자랑스럽다는 할머니의 뗏마배 사랑이 느껴진다. 할머니에게 뗏마배는 삶의 산증인이자, 함께 늙어가는 친구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지런한 마을이어라"

한적하고 고즈넉한 섬마을에서 가가호호 합쳐봐야 마을 주민들은 몇십 명도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의 낮 마실 풍경은 항상 조용하다. 이유는 언제나 일터인 바다에서 부지런하게 일하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이다.
마을 어르신들은 새벽부터 미역이며 톳을 채취하고, 전복과 우럭을 키우는 가두리 양식으로 쉴새 없이 바쁘다. 육지에서는 이름도 낯선 섬이지만, 어장에 자원이 풍부하고 바다가 내어주는 먹거리가 넘쳐나니 '부자섬'으로 불리기도 한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 했던가. '돈주머니 실밥 터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라는 대둔도는 낯선 이방인들의 방문에도 인심 또한 넉넉하다. 외지 사람들에게도 기꺼이 바다 한상차림을 내어준다. 돈만큼이나 인심 또한 부자인 셈이다.
그래서 대둔도는 비옥한 어부의 땅이자 넉넉하게 내어주는 인정이 넘치는 섬이다.

자세한 내용은 6월 10일(토) 저녁 7시 10분 KBS 1TV '다큐 공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프로덕션2] 문경림 kbs.petitlim@kbs.co.kr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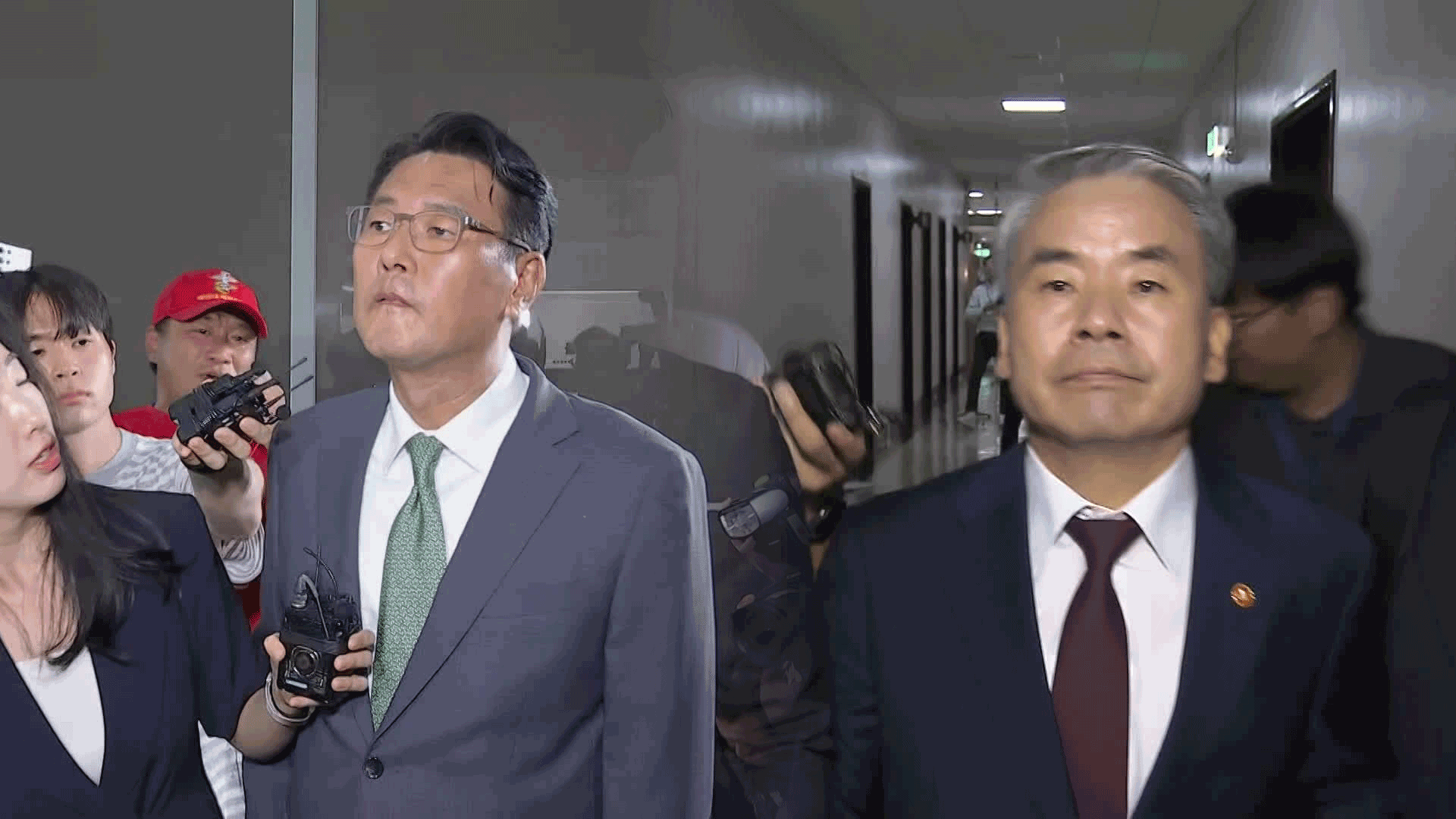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