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영익 교수(서강대학교 경제학부) “美 금리 인상, 우리 수출 위축 가능성 대비해야” ②
입력 2017.06.16 (10: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6월 16일(금요일)
□ 출연자 : 김영익 교수(서강대학교 경제학부)
“美 금리 인상, 우리 수출 위축 가능성 대비해야”
[윤준호] 예상했던 대로 미국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금리 인상으로 1.00%~1.25%대로 상향 조정됐고요. 이와 함께 연준의 4조 500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 축소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금리를 올리고 자산을 축소하겠다는 미 연준의 방침. 그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요?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김영익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김영익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영익]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미국이 금리를 올렸지만 충분히 예상됐던 것이기 때문인지 우리 외환시장에서는 큰 반응이 없었어요.
[김영익] 예상됐기 때문에 단기 충격은 별로 없었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가 0.5% 떨어졌는데 큰 충격은 아니었습니다. 환율도 1124원에서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장기 금리는 미국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도 미국 금리도 떨어지고 오히려 우리 금리도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금융시장에 단기적으로 큰 충격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금리가 1.25%인데요. 미국이 1%~1.25%니까 그 상단이 우리와 같아졌어요. 그리고 미국이 올해 안에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게 확실시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미국과 우리 금리가 역전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더 높아지는 거죠?
[김영익]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무슨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김영익] 과거에도 두 차례 있었어요. 1999년 6월에서 2001년 3월, 2005년 6월, 2007년 8월 이 당시도 미국 금리가 우리 금리보다 더 높아졌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금리가 우리 금리보다 높으면,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서 수입률이 높은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는 돈이 그렇게 빠져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외국에 우리나라 자금이 많이 빠져나간 시기를 보니까 1997년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됐는데요. 2008년하고 2009년에 빠져나갔고 2015년에 중국이 경착륙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제기됐었어요. 그래서 과거 우리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이유를 보면 우리 경제가 매우 나빴거나 글로벌 금융시장이 위기에 빠졌거나 달러가 강세였다거나 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그렇지만 우리한테도 금리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우리 경제 상황, 특히 수출이라든가 무역 여건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한국은행의 경우에도 금리 인상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요. 그런데 문제는 금리를 우리가 올릴 수도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상황 아닌가요?
[김영익]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요.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죠. 가계부채가 1360조 정도 되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금리를 안 올리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윤준호] 지금 우리가 외국인 자금이 얼마나 돼요?
[김영익] 지난달 말 기준인데요. 주식이 581조, 채권이 102조 합쳐서 683조 정도 됩니다.
[윤준호] 거의 700조나 되네요.
[김영익]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거의 42%가 미국계 자금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이런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거죠.
[윤준호] 그런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올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를 추가로 올려서 우리보다 금리가 더 높아지고 또 앞으로도 계속 올릴 경우 미국계 자금이 대부분인 외국인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 자금이 많이 이탈할 것으로 보세요?
[김영익] 단기적으로는 별로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모든 경제 기관들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좀 올렸거든요. 과거 외국인 자금들이 많이 이탈했던 거는 우리 경제가 97년처럼 매우 나쁠 때였어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나빠지니까 우리도 신흥 시장에 속하니까 전이 효과로 많이 빠져나갔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그런 문제는 대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이거든요. 통화 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금리도 정상화되고 있는데요.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예를 들어서 미국 주가, 부동산, 신흥 시장 주가 이런 것들이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정상화되면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양상이 올 하반기 늦게나 내년 초에는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러나 그 양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군요.
[김영익] 네.
[윤준호] 우리 금리를 지금 올리기는 올려야 되는 상황이죠?
[김영익] 네. 현재 1.25%인데요. 한국은행 총재도 경기가 회복되면 올릴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올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 수출은 회복되고 있지만 내수는 아직 나쁩니다. 그다음에 우리 물가가 높이 올라서 2%대입니다마는 물론 소비자 물가도 2%에 올랐습니다마는 근원 물가는 1.5% 안팎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준호]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요.
[김영익]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만약에 금리를 인상한다면 언제쯤 인상할 것 같아요?
[김영익] 미국이 올 연말쯤에 한 번 더 올리면 그때 인상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와 미국 경제 여건이 다르거든요. 금리에는 경제성장률하고 물가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금리는 현재의 경제뿐만 아니라, 장단기적으로 축소되고 확대되고 이게 미래 경제를 예측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장기 금리는 오히려 미국보다 낮아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2.16%였는데 우리나라는 2.12%에서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에서는 우리 경제성장률이 미국보다도 낮아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뒤따라 올려야 되기는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펀더멘탈을 보고 금리 결정을 하는 게 통화 정책 당국의 견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준호]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일본 등도 시중에 풀어두었던 돈을 이제는 거두어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사인을 이제 받았다는 거겠죠?
[김영익] 그렇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일본, 유럽 중앙은행도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시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풀기 시작한 시점도 많이 다르거든요. 2008년에 미국이 돈을 풀기 시작했고요. 일본이 2012년, 유럽 중앙은행이 2015년에 풀었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일본이나 유럽 중앙은행이 돈을 거둬들이는 시기는 미국보다는 조금 늦은 내년 이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준호] EU나 일본이 만약에 풀어두었던 돈을 거둬들이고 확장 정책을 멈추게 되면 우리 수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김영익] 사실 금리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소비거든요. 그동안 금리를 내렸던 게 소비와 투자, 특히 소비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렸던 것이죠. 그런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금리를 계속 내렸더니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자가 된 것처럼 부의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일본,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이런 선진국의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수출도 상대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경제가 올해 들어서 회복되고 있습니다마는 소비 등 내수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수출은 상대적으로 좋았는데 선진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수출이 감소되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윤준호]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이 연준의 자산을 4조 5천억 달러 축소하겠다는 건데요. 이건 채권을 시중에 팔고 달러를 거둬들이겠다는 뜻이죠?
[김영익]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미국 통화정책 과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가 시작됐는데 금리를 5.25%에서, 연방기금금리죠, 0%까지 내리고 그다음에 양적 완화라고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풀어서 국채나 주택저당채권, 즉 MBS라고 하죠. 이걸 많이 다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많이 풀고 금리를 내리니까 소비도 오르고 주식 부동산이 오르니까 2014년 10월부터는 미국이 양적 완화를 종료했어요. 그리고 2015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네 차례 금리를 인상했지 않습니까? 다음 통화 정책 정상화 단계가 그동안 국채나 주택담보채권을 사주면서 돈을 한 4조 5천억 달러 정도 풀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줄이겠다는 거죠. 그걸 시장에 팔아서 시장에 풀린 돈을 환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준호] 그러면 이게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과 사인을 주게 될까요?
[김영익] 아마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자산까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나 기업 수익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르고요.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2008년,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전 세계가 부채에 의해서 성장했거든요. 미국도 경기가 나쁘니까 정부가 돈을 써서 경기를 부양했었고 브라질 같은 데도 정부부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외채가 많이 늘어난 나라는 터키고요. 기업 부채가 많이 늘어난 나라는 또 중국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났죠. 전 세계으로 금리 정상화의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각 국가별로 영향은 상이하겠습니다마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부채를 늘림으로써 이룬 경기 진작 효과에서 이제는 그 부채를 거둬들여서 축소하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김영익] 네, 그렇죠.
[윤준호] 그렇다면 지금 우리 경제가 펀더멘탈이 괜찮고 수출도 괜찮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또 낙관은 안 된다는 말도 많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앞으로도 더 금리를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영익] 미국이 지금 장기적으로 현재 연방기금금리가 1.25%인데 3%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올리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겠다고 이렇게 했어도 통화를 환수하겠다고 했어도 오히려 시장 금리는 떨어졌거든요. 금년의 경제와 물가가 반영되는데 저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가 둔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과감하게 3%까지 빨리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낮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화 정책이 정상화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자산까지 떨어지고 세계 소비가 위축되고 우리나라 수출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통화 정책은 국민의 여건을 적절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동안 경제성장이나 물가가 별로 안 좋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조심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익]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의 김영익 교수였습니다.
□ 출연자 : 김영익 교수(서강대학교 경제학부)
“美 금리 인상, 우리 수출 위축 가능성 대비해야”
[윤준호] 예상했던 대로 미국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금리 인상으로 1.00%~1.25%대로 상향 조정됐고요. 이와 함께 연준의 4조 500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 축소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금리를 올리고 자산을 축소하겠다는 미 연준의 방침. 그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요?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김영익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김영익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영익]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미국이 금리를 올렸지만 충분히 예상됐던 것이기 때문인지 우리 외환시장에서는 큰 반응이 없었어요.
[김영익] 예상됐기 때문에 단기 충격은 별로 없었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가 0.5% 떨어졌는데 큰 충격은 아니었습니다. 환율도 1124원에서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장기 금리는 미국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도 미국 금리도 떨어지고 오히려 우리 금리도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금융시장에 단기적으로 큰 충격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금리가 1.25%인데요. 미국이 1%~1.25%니까 그 상단이 우리와 같아졌어요. 그리고 미국이 올해 안에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게 확실시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미국과 우리 금리가 역전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더 높아지는 거죠?
[김영익]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무슨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김영익] 과거에도 두 차례 있었어요. 1999년 6월에서 2001년 3월, 2005년 6월, 2007년 8월 이 당시도 미국 금리가 우리 금리보다 더 높아졌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금리가 우리 금리보다 높으면,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서 수입률이 높은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는 돈이 그렇게 빠져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외국에 우리나라 자금이 많이 빠져나간 시기를 보니까 1997년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됐는데요. 2008년하고 2009년에 빠져나갔고 2015년에 중국이 경착륙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제기됐었어요. 그래서 과거 우리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이유를 보면 우리 경제가 매우 나빴거나 글로벌 금융시장이 위기에 빠졌거나 달러가 강세였다거나 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그렇지만 우리한테도 금리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우리 경제 상황, 특히 수출이라든가 무역 여건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한국은행의 경우에도 금리 인상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요. 그런데 문제는 금리를 우리가 올릴 수도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상황 아닌가요?
[김영익]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요.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죠. 가계부채가 1360조 정도 되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금리를 안 올리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윤준호] 지금 우리가 외국인 자금이 얼마나 돼요?
[김영익] 지난달 말 기준인데요. 주식이 581조, 채권이 102조 합쳐서 683조 정도 됩니다.
[윤준호] 거의 700조나 되네요.
[김영익]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거의 42%가 미국계 자금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이런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거죠.
[윤준호] 그런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올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를 추가로 올려서 우리보다 금리가 더 높아지고 또 앞으로도 계속 올릴 경우 미국계 자금이 대부분인 외국인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 자금이 많이 이탈할 것으로 보세요?
[김영익] 단기적으로는 별로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모든 경제 기관들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좀 올렸거든요. 과거 외국인 자금들이 많이 이탈했던 거는 우리 경제가 97년처럼 매우 나쁠 때였어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나빠지니까 우리도 신흥 시장에 속하니까 전이 효과로 많이 빠져나갔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그런 문제는 대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이거든요. 통화 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금리도 정상화되고 있는데요.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예를 들어서 미국 주가, 부동산, 신흥 시장 주가 이런 것들이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정상화되면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양상이 올 하반기 늦게나 내년 초에는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러나 그 양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군요.
[김영익] 네.
[윤준호] 우리 금리를 지금 올리기는 올려야 되는 상황이죠?
[김영익] 네. 현재 1.25%인데요. 한국은행 총재도 경기가 회복되면 올릴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올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 수출은 회복되고 있지만 내수는 아직 나쁩니다. 그다음에 우리 물가가 높이 올라서 2%대입니다마는 물론 소비자 물가도 2%에 올랐습니다마는 근원 물가는 1.5% 안팎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준호]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요.
[김영익]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만약에 금리를 인상한다면 언제쯤 인상할 것 같아요?
[김영익] 미국이 올 연말쯤에 한 번 더 올리면 그때 인상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와 미국 경제 여건이 다르거든요. 금리에는 경제성장률하고 물가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금리는 현재의 경제뿐만 아니라, 장단기적으로 축소되고 확대되고 이게 미래 경제를 예측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장기 금리는 오히려 미국보다 낮아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2.16%였는데 우리나라는 2.12%에서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에서는 우리 경제성장률이 미국보다도 낮아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뒤따라 올려야 되기는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펀더멘탈을 보고 금리 결정을 하는 게 통화 정책 당국의 견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준호]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일본 등도 시중에 풀어두었던 돈을 이제는 거두어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사인을 이제 받았다는 거겠죠?
[김영익] 그렇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일본, 유럽 중앙은행도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시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풀기 시작한 시점도 많이 다르거든요. 2008년에 미국이 돈을 풀기 시작했고요. 일본이 2012년, 유럽 중앙은행이 2015년에 풀었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일본이나 유럽 중앙은행이 돈을 거둬들이는 시기는 미국보다는 조금 늦은 내년 이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준호] EU나 일본이 만약에 풀어두었던 돈을 거둬들이고 확장 정책을 멈추게 되면 우리 수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김영익] 사실 금리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소비거든요. 그동안 금리를 내렸던 게 소비와 투자, 특히 소비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렸던 것이죠. 그런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금리를 계속 내렸더니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자가 된 것처럼 부의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일본,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이런 선진국의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수출도 상대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경제가 올해 들어서 회복되고 있습니다마는 소비 등 내수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수출은 상대적으로 좋았는데 선진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수출이 감소되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윤준호]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이 연준의 자산을 4조 5천억 달러 축소하겠다는 건데요. 이건 채권을 시중에 팔고 달러를 거둬들이겠다는 뜻이죠?
[김영익]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미국 통화정책 과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가 시작됐는데 금리를 5.25%에서, 연방기금금리죠, 0%까지 내리고 그다음에 양적 완화라고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풀어서 국채나 주택저당채권, 즉 MBS라고 하죠. 이걸 많이 다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많이 풀고 금리를 내리니까 소비도 오르고 주식 부동산이 오르니까 2014년 10월부터는 미국이 양적 완화를 종료했어요. 그리고 2015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네 차례 금리를 인상했지 않습니까? 다음 통화 정책 정상화 단계가 그동안 국채나 주택담보채권을 사주면서 돈을 한 4조 5천억 달러 정도 풀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줄이겠다는 거죠. 그걸 시장에 팔아서 시장에 풀린 돈을 환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준호] 그러면 이게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과 사인을 주게 될까요?
[김영익] 아마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자산까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나 기업 수익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르고요.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2008년,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전 세계가 부채에 의해서 성장했거든요. 미국도 경기가 나쁘니까 정부가 돈을 써서 경기를 부양했었고 브라질 같은 데도 정부부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외채가 많이 늘어난 나라는 터키고요. 기업 부채가 많이 늘어난 나라는 또 중국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났죠. 전 세계으로 금리 정상화의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각 국가별로 영향은 상이하겠습니다마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부채를 늘림으로써 이룬 경기 진작 효과에서 이제는 그 부채를 거둬들여서 축소하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김영익] 네, 그렇죠.
[윤준호] 그렇다면 지금 우리 경제가 펀더멘탈이 괜찮고 수출도 괜찮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또 낙관은 안 된다는 말도 많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앞으로도 더 금리를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영익] 미국이 지금 장기적으로 현재 연방기금금리가 1.25%인데 3%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올리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겠다고 이렇게 했어도 통화를 환수하겠다고 했어도 오히려 시장 금리는 떨어졌거든요. 금년의 경제와 물가가 반영되는데 저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가 둔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과감하게 3%까지 빨리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낮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화 정책이 정상화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자산까지 떨어지고 세계 소비가 위축되고 우리나라 수출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통화 정책은 국민의 여건을 적절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동안 경제성장이나 물가가 별로 안 좋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조심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익]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의 김영익 교수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터뷰] 김영익 교수(서강대학교 경제학부) “美 금리 인상, 우리 수출 위축 가능성 대비해야” ②
-
- 입력 2017-06-16 10:37:19

□ 방송일시 : 2017년 6월 16일(금요일)
□ 출연자 : 김영익 교수(서강대학교 경제학부)
“美 금리 인상, 우리 수출 위축 가능성 대비해야”
[윤준호] 예상했던 대로 미국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금리 인상으로 1.00%~1.25%대로 상향 조정됐고요. 이와 함께 연준의 4조 500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 축소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금리를 올리고 자산을 축소하겠다는 미 연준의 방침. 그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요?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김영익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김영익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영익]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미국이 금리를 올렸지만 충분히 예상됐던 것이기 때문인지 우리 외환시장에서는 큰 반응이 없었어요.
[김영익] 예상됐기 때문에 단기 충격은 별로 없었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가 0.5% 떨어졌는데 큰 충격은 아니었습니다. 환율도 1124원에서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장기 금리는 미국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도 미국 금리도 떨어지고 오히려 우리 금리도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금융시장에 단기적으로 큰 충격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금리가 1.25%인데요. 미국이 1%~1.25%니까 그 상단이 우리와 같아졌어요. 그리고 미국이 올해 안에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게 확실시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미국과 우리 금리가 역전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더 높아지는 거죠?
[김영익]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무슨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김영익] 과거에도 두 차례 있었어요. 1999년 6월에서 2001년 3월, 2005년 6월, 2007년 8월 이 당시도 미국 금리가 우리 금리보다 더 높아졌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금리가 우리 금리보다 높으면,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서 수입률이 높은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는 돈이 그렇게 빠져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외국에 우리나라 자금이 많이 빠져나간 시기를 보니까 1997년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됐는데요. 2008년하고 2009년에 빠져나갔고 2015년에 중국이 경착륙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제기됐었어요. 그래서 과거 우리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이유를 보면 우리 경제가 매우 나빴거나 글로벌 금융시장이 위기에 빠졌거나 달러가 강세였다거나 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그렇지만 우리한테도 금리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우리 경제 상황, 특히 수출이라든가 무역 여건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한국은행의 경우에도 금리 인상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요. 그런데 문제는 금리를 우리가 올릴 수도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상황 아닌가요?
[김영익]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요.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죠. 가계부채가 1360조 정도 되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금리를 안 올리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윤준호] 지금 우리가 외국인 자금이 얼마나 돼요?
[김영익] 지난달 말 기준인데요. 주식이 581조, 채권이 102조 합쳐서 683조 정도 됩니다.
[윤준호] 거의 700조나 되네요.
[김영익]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거의 42%가 미국계 자금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이런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거죠.
[윤준호] 그런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올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를 추가로 올려서 우리보다 금리가 더 높아지고 또 앞으로도 계속 올릴 경우 미국계 자금이 대부분인 외국인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 자금이 많이 이탈할 것으로 보세요?
[김영익] 단기적으로는 별로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모든 경제 기관들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좀 올렸거든요. 과거 외국인 자금들이 많이 이탈했던 거는 우리 경제가 97년처럼 매우 나쁠 때였어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나빠지니까 우리도 신흥 시장에 속하니까 전이 효과로 많이 빠져나갔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그런 문제는 대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이거든요. 통화 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금리도 정상화되고 있는데요.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예를 들어서 미국 주가, 부동산, 신흥 시장 주가 이런 것들이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정상화되면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양상이 올 하반기 늦게나 내년 초에는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러나 그 양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군요.
[김영익] 네.
[윤준호] 우리 금리를 지금 올리기는 올려야 되는 상황이죠?
[김영익] 네. 현재 1.25%인데요. 한국은행 총재도 경기가 회복되면 올릴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올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 수출은 회복되고 있지만 내수는 아직 나쁩니다. 그다음에 우리 물가가 높이 올라서 2%대입니다마는 물론 소비자 물가도 2%에 올랐습니다마는 근원 물가는 1.5% 안팎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준호]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요.
[김영익]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만약에 금리를 인상한다면 언제쯤 인상할 것 같아요?
[김영익] 미국이 올 연말쯤에 한 번 더 올리면 그때 인상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와 미국 경제 여건이 다르거든요. 금리에는 경제성장률하고 물가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금리는 현재의 경제뿐만 아니라, 장단기적으로 축소되고 확대되고 이게 미래 경제를 예측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장기 금리는 오히려 미국보다 낮아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2.16%였는데 우리나라는 2.12%에서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에서는 우리 경제성장률이 미국보다도 낮아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뒤따라 올려야 되기는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펀더멘탈을 보고 금리 결정을 하는 게 통화 정책 당국의 견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준호]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일본 등도 시중에 풀어두었던 돈을 이제는 거두어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사인을 이제 받았다는 거겠죠?
[김영익] 그렇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일본, 유럽 중앙은행도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시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풀기 시작한 시점도 많이 다르거든요. 2008년에 미국이 돈을 풀기 시작했고요. 일본이 2012년, 유럽 중앙은행이 2015년에 풀었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일본이나 유럽 중앙은행이 돈을 거둬들이는 시기는 미국보다는 조금 늦은 내년 이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준호] EU나 일본이 만약에 풀어두었던 돈을 거둬들이고 확장 정책을 멈추게 되면 우리 수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김영익] 사실 금리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소비거든요. 그동안 금리를 내렸던 게 소비와 투자, 특히 소비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렸던 것이죠. 그런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금리를 계속 내렸더니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자가 된 것처럼 부의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일본,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이런 선진국의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수출도 상대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경제가 올해 들어서 회복되고 있습니다마는 소비 등 내수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수출은 상대적으로 좋았는데 선진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수출이 감소되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윤준호]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이 연준의 자산을 4조 5천억 달러 축소하겠다는 건데요. 이건 채권을 시중에 팔고 달러를 거둬들이겠다는 뜻이죠?
[김영익]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미국 통화정책 과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가 시작됐는데 금리를 5.25%에서, 연방기금금리죠, 0%까지 내리고 그다음에 양적 완화라고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풀어서 국채나 주택저당채권, 즉 MBS라고 하죠. 이걸 많이 다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많이 풀고 금리를 내리니까 소비도 오르고 주식 부동산이 오르니까 2014년 10월부터는 미국이 양적 완화를 종료했어요. 그리고 2015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네 차례 금리를 인상했지 않습니까? 다음 통화 정책 정상화 단계가 그동안 국채나 주택담보채권을 사주면서 돈을 한 4조 5천억 달러 정도 풀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줄이겠다는 거죠. 그걸 시장에 팔아서 시장에 풀린 돈을 환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준호] 그러면 이게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과 사인을 주게 될까요?
[김영익] 아마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자산까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나 기업 수익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르고요.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2008년,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전 세계가 부채에 의해서 성장했거든요. 미국도 경기가 나쁘니까 정부가 돈을 써서 경기를 부양했었고 브라질 같은 데도 정부부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외채가 많이 늘어난 나라는 터키고요. 기업 부채가 많이 늘어난 나라는 또 중국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났죠. 전 세계으로 금리 정상화의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각 국가별로 영향은 상이하겠습니다마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부채를 늘림으로써 이룬 경기 진작 효과에서 이제는 그 부채를 거둬들여서 축소하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김영익] 네, 그렇죠.
[윤준호] 그렇다면 지금 우리 경제가 펀더멘탈이 괜찮고 수출도 괜찮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또 낙관은 안 된다는 말도 많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앞으로도 더 금리를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영익] 미국이 지금 장기적으로 현재 연방기금금리가 1.25%인데 3%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올리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겠다고 이렇게 했어도 통화를 환수하겠다고 했어도 오히려 시장 금리는 떨어졌거든요. 금년의 경제와 물가가 반영되는데 저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가 둔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과감하게 3%까지 빨리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낮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화 정책이 정상화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자산까지 떨어지고 세계 소비가 위축되고 우리나라 수출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통화 정책은 국민의 여건을 적절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동안 경제성장이나 물가가 별로 안 좋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조심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익]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의 김영익 교수였습니다.
□ 출연자 : 김영익 교수(서강대학교 경제학부)
“美 금리 인상, 우리 수출 위축 가능성 대비해야”
[윤준호] 예상했던 대로 미국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금리 인상으로 1.00%~1.25%대로 상향 조정됐고요. 이와 함께 연준의 4조 500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 축소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금리를 올리고 자산을 축소하겠다는 미 연준의 방침. 그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요?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김영익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김영익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영익]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미국이 금리를 올렸지만 충분히 예상됐던 것이기 때문인지 우리 외환시장에서는 큰 반응이 없었어요.
[김영익] 예상됐기 때문에 단기 충격은 별로 없었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가 0.5% 떨어졌는데 큰 충격은 아니었습니다. 환율도 1124원에서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장기 금리는 미국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도 미국 금리도 떨어지고 오히려 우리 금리도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금융시장에 단기적으로 큰 충격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금리가 1.25%인데요. 미국이 1%~1.25%니까 그 상단이 우리와 같아졌어요. 그리고 미국이 올해 안에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게 확실시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미국과 우리 금리가 역전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더 높아지는 거죠?
[김영익]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무슨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김영익] 과거에도 두 차례 있었어요. 1999년 6월에서 2001년 3월, 2005년 6월, 2007년 8월 이 당시도 미국 금리가 우리 금리보다 더 높아졌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금리가 우리 금리보다 높으면,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서 수입률이 높은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는 돈이 그렇게 빠져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외국에 우리나라 자금이 많이 빠져나간 시기를 보니까 1997년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됐는데요. 2008년하고 2009년에 빠져나갔고 2015년에 중국이 경착륙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제기됐었어요. 그래서 과거 우리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이유를 보면 우리 경제가 매우 나빴거나 글로벌 금융시장이 위기에 빠졌거나 달러가 강세였다거나 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그렇지만 우리한테도 금리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우리 경제 상황, 특히 수출이라든가 무역 여건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한국은행의 경우에도 금리 인상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요. 그런데 문제는 금리를 우리가 올릴 수도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상황 아닌가요?
[김영익]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요.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죠. 가계부채가 1360조 정도 되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금리를 안 올리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윤준호] 지금 우리가 외국인 자금이 얼마나 돼요?
[김영익] 지난달 말 기준인데요. 주식이 581조, 채권이 102조 합쳐서 683조 정도 됩니다.
[윤준호] 거의 700조나 되네요.
[김영익]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거의 42%가 미국계 자금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이런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거죠.
[윤준호] 그런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올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를 추가로 올려서 우리보다 금리가 더 높아지고 또 앞으로도 계속 올릴 경우 미국계 자금이 대부분인 외국인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 자금이 많이 이탈할 것으로 보세요?
[김영익] 단기적으로는 별로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모든 경제 기관들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좀 올렸거든요. 과거 외국인 자금들이 많이 이탈했던 거는 우리 경제가 97년처럼 매우 나쁠 때였어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나빠지니까 우리도 신흥 시장에 속하니까 전이 효과로 많이 빠져나갔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그런 문제는 대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이거든요. 통화 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금리도 정상화되고 있는데요.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예를 들어서 미국 주가, 부동산, 신흥 시장 주가 이런 것들이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정상화되면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양상이 올 하반기 늦게나 내년 초에는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러나 그 양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군요.
[김영익] 네.
[윤준호] 우리 금리를 지금 올리기는 올려야 되는 상황이죠?
[김영익] 네. 현재 1.25%인데요. 한국은행 총재도 경기가 회복되면 올릴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올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 수출은 회복되고 있지만 내수는 아직 나쁩니다. 그다음에 우리 물가가 높이 올라서 2%대입니다마는 물론 소비자 물가도 2%에 올랐습니다마는 근원 물가는 1.5% 안팎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준호]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요.
[김영익]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만약에 금리를 인상한다면 언제쯤 인상할 것 같아요?
[김영익] 미국이 올 연말쯤에 한 번 더 올리면 그때 인상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와 미국 경제 여건이 다르거든요. 금리에는 경제성장률하고 물가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금리는 현재의 경제뿐만 아니라, 장단기적으로 축소되고 확대되고 이게 미래 경제를 예측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장기 금리는 오히려 미국보다 낮아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2.16%였는데 우리나라는 2.12%에서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에서는 우리 경제성장률이 미국보다도 낮아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뒤따라 올려야 되기는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펀더멘탈을 보고 금리 결정을 하는 게 통화 정책 당국의 견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준호]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일본 등도 시중에 풀어두었던 돈을 이제는 거두어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사인을 이제 받았다는 거겠죠?
[김영익] 그렇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일본, 유럽 중앙은행도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시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풀기 시작한 시점도 많이 다르거든요. 2008년에 미국이 돈을 풀기 시작했고요. 일본이 2012년, 유럽 중앙은행이 2015년에 풀었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일본이나 유럽 중앙은행이 돈을 거둬들이는 시기는 미국보다는 조금 늦은 내년 이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준호] EU나 일본이 만약에 풀어두었던 돈을 거둬들이고 확장 정책을 멈추게 되면 우리 수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김영익] 사실 금리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소비거든요. 그동안 금리를 내렸던 게 소비와 투자, 특히 소비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렸던 것이죠. 그런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금리를 계속 내렸더니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자가 된 것처럼 부의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일본,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이런 선진국의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수출도 상대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경제가 올해 들어서 회복되고 있습니다마는 소비 등 내수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수출은 상대적으로 좋았는데 선진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수출이 감소되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윤준호]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이 연준의 자산을 4조 5천억 달러 축소하겠다는 건데요. 이건 채권을 시중에 팔고 달러를 거둬들이겠다는 뜻이죠?
[김영익]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미국 통화정책 과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가 시작됐는데 금리를 5.25%에서, 연방기금금리죠, 0%까지 내리고 그다음에 양적 완화라고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풀어서 국채나 주택저당채권, 즉 MBS라고 하죠. 이걸 많이 다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많이 풀고 금리를 내리니까 소비도 오르고 주식 부동산이 오르니까 2014년 10월부터는 미국이 양적 완화를 종료했어요. 그리고 2015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네 차례 금리를 인상했지 않습니까? 다음 통화 정책 정상화 단계가 그동안 국채나 주택담보채권을 사주면서 돈을 한 4조 5천억 달러 정도 풀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줄이겠다는 거죠. 그걸 시장에 팔아서 시장에 풀린 돈을 환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준호] 그러면 이게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과 사인을 주게 될까요?
[김영익] 아마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자산까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나 기업 수익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르고요.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2008년,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전 세계가 부채에 의해서 성장했거든요. 미국도 경기가 나쁘니까 정부가 돈을 써서 경기를 부양했었고 브라질 같은 데도 정부부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외채가 많이 늘어난 나라는 터키고요. 기업 부채가 많이 늘어난 나라는 또 중국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났죠. 전 세계으로 금리 정상화의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각 국가별로 영향은 상이하겠습니다마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부채를 늘림으로써 이룬 경기 진작 효과에서 이제는 그 부채를 거둬들여서 축소하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김영익] 네, 그렇죠.
[윤준호] 그렇다면 지금 우리 경제가 펀더멘탈이 괜찮고 수출도 괜찮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또 낙관은 안 된다는 말도 많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앞으로도 더 금리를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영익] 미국이 지금 장기적으로 현재 연방기금금리가 1.25%인데 3%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올리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겠다고 이렇게 했어도 통화를 환수하겠다고 했어도 오히려 시장 금리는 떨어졌거든요. 금년의 경제와 물가가 반영되는데 저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가 둔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과감하게 3%까지 빨리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낮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화 정책이 정상화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자산까지 떨어지고 세계 소비가 위축되고 우리나라 수출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통화 정책은 국민의 여건을 적절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동안 경제성장이나 물가가 별로 안 좋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조심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익]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의 김영익 교수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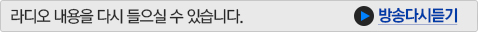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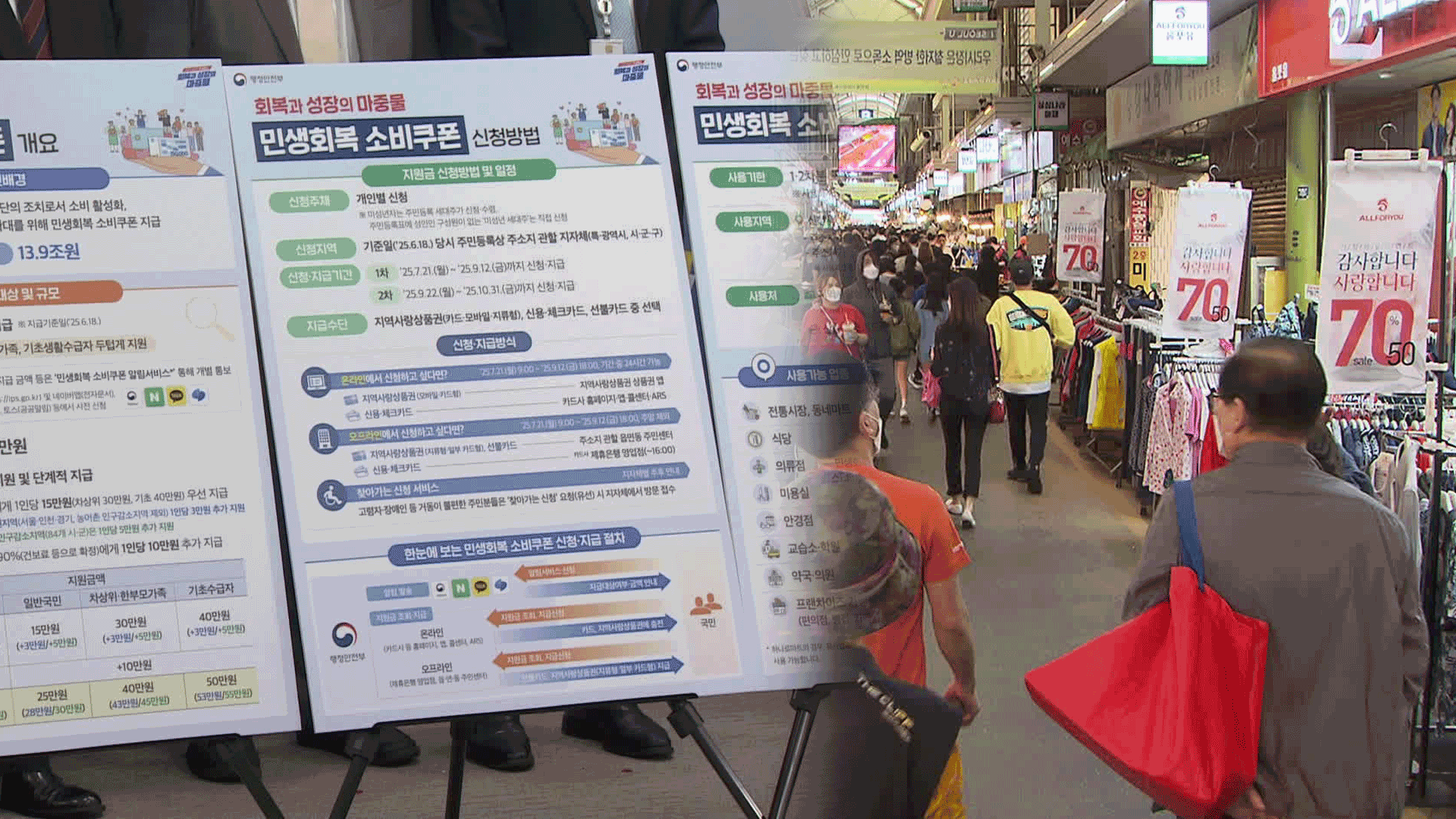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