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농축우라늄 핵기술 외부 유입
입력 2002.10.18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왜 우라늄 농축방식을 채택해서 그 동안 어떻게 핵개발을 해 왔을까 하는 점도 궁금합니다.
이흥철 기자가 이런 의문을 풀어봅니다.
⊙기자: 지난 8월 아이코노스 위성이 촬영한 북한 영변 지역입니다.
북한은 지난 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지역의 핵시설에서 풀루토늄을 추출해 핵물질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대부분 동결했습니다.
이곳에는 연구용 원자로와 5메가와트 실험로 원자로, 50메가와트 원자력발전소와 핵연료 저장시설이 있고 이외에도 태천에 건설중이던 200메가와트 원자력발전소 등이94년 당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에는 평산과 순천 등에 2600만 톤의 우라늄이 매장돼 있고 실제 채굴할 수 있는 양만 400만 톤에 이릅니다.
대부분의 시설이 동결된 상태에서 우라늄 농축방식을 이용한 핵물질 확보는 북한에게는 새로운 방법으로 떠올랐습니다.
플루토늄 방식보다 우라늄이 무기로 만들기에 용이하고 농축이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필요시설은 보다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김종경(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우라늄 같은 경우는 원자로가 별도로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재처리시설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농축시설만 갖고 있으면 농축우라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죠.
⊙기자: 농축우라늄의 개발장소로는 북한의 자강도 하갑이 꼽히고 있다고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에 제시한 증거는 가스원심분리법을 이용한 농축장치를 외부에서 반입하려던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기술을 보유한 파키스탄의 과학자가 몇 년 전 북한에 간 정황 등을 포함해 우리 정부도 이 같은 상황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장세현(통일부 장관/KBS 1R 출연): 농축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기자: 그러나 핵물질을 무기로 만들 수 있는 양인 25kg을 확보하더라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10년에 이르는 실험기간과 100명 이상의 과학자가 필요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북한의 핵개발 시도를 감지해 왔지만 아직은 초기단계의 연구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KBS뉴스 이흥철입니다.
이흥철 기자가 이런 의문을 풀어봅니다.
⊙기자: 지난 8월 아이코노스 위성이 촬영한 북한 영변 지역입니다.
북한은 지난 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지역의 핵시설에서 풀루토늄을 추출해 핵물질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대부분 동결했습니다.
이곳에는 연구용 원자로와 5메가와트 실험로 원자로, 50메가와트 원자력발전소와 핵연료 저장시설이 있고 이외에도 태천에 건설중이던 200메가와트 원자력발전소 등이94년 당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에는 평산과 순천 등에 2600만 톤의 우라늄이 매장돼 있고 실제 채굴할 수 있는 양만 400만 톤에 이릅니다.
대부분의 시설이 동결된 상태에서 우라늄 농축방식을 이용한 핵물질 확보는 북한에게는 새로운 방법으로 떠올랐습니다.
플루토늄 방식보다 우라늄이 무기로 만들기에 용이하고 농축이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필요시설은 보다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김종경(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우라늄 같은 경우는 원자로가 별도로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재처리시설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농축시설만 갖고 있으면 농축우라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죠.
⊙기자: 농축우라늄의 개발장소로는 북한의 자강도 하갑이 꼽히고 있다고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에 제시한 증거는 가스원심분리법을 이용한 농축장치를 외부에서 반입하려던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기술을 보유한 파키스탄의 과학자가 몇 년 전 북한에 간 정황 등을 포함해 우리 정부도 이 같은 상황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장세현(통일부 장관/KBS 1R 출연): 농축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기자: 그러나 핵물질을 무기로 만들 수 있는 양인 25kg을 확보하더라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10년에 이르는 실험기간과 100명 이상의 과학자가 필요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북한의 핵개발 시도를 감지해 왔지만 아직은 초기단계의 연구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KBS뉴스 이흥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북 농축우라늄 핵기술 외부 유입
-
- 입력 2002-10-18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북한이 왜 우라늄 농축방식을 채택해서 그 동안 어떻게 핵개발을 해 왔을까 하는 점도 궁금합니다.
이흥철 기자가 이런 의문을 풀어봅니다.
⊙기자: 지난 8월 아이코노스 위성이 촬영한 북한 영변 지역입니다.
북한은 지난 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지역의 핵시설에서 풀루토늄을 추출해 핵물질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대부분 동결했습니다.
이곳에는 연구용 원자로와 5메가와트 실험로 원자로, 50메가와트 원자력발전소와 핵연료 저장시설이 있고 이외에도 태천에 건설중이던 200메가와트 원자력발전소 등이94년 당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에는 평산과 순천 등에 2600만 톤의 우라늄이 매장돼 있고 실제 채굴할 수 있는 양만 400만 톤에 이릅니다.
대부분의 시설이 동결된 상태에서 우라늄 농축방식을 이용한 핵물질 확보는 북한에게는 새로운 방법으로 떠올랐습니다.
플루토늄 방식보다 우라늄이 무기로 만들기에 용이하고 농축이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필요시설은 보다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김종경(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우라늄 같은 경우는 원자로가 별도로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재처리시설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농축시설만 갖고 있으면 농축우라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죠.
⊙기자: 농축우라늄의 개발장소로는 북한의 자강도 하갑이 꼽히고 있다고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에 제시한 증거는 가스원심분리법을 이용한 농축장치를 외부에서 반입하려던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기술을 보유한 파키스탄의 과학자가 몇 년 전 북한에 간 정황 등을 포함해 우리 정부도 이 같은 상황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장세현(통일부 장관/KBS 1R 출연): 농축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기자: 그러나 핵물질을 무기로 만들 수 있는 양인 25kg을 확보하더라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10년에 이르는 실험기간과 100명 이상의 과학자가 필요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북한의 핵개발 시도를 감지해 왔지만 아직은 초기단계의 연구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KBS뉴스 이흥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속보] 창녕군, 낙동강 홍수 우려…우강리 강마을 주민 대피령](/attach/image/2025/03/23/20250323_8Sjy5d.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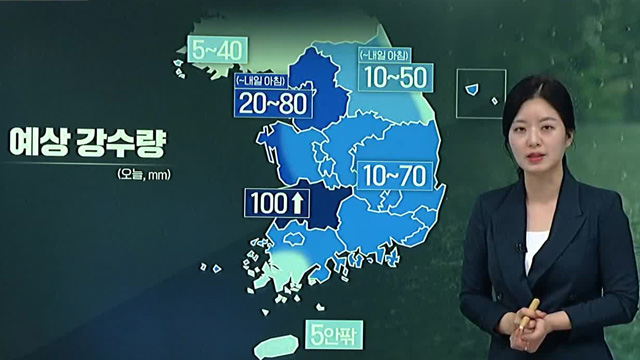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