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허리케인’ 마이클, 美 플로리다 상륙…피해 속출
입력 2018.10.11 (12:38)
수정 2018.10.11 (19: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초강력 허리케인 마이클이 미국 플로리다에 상륙하면서 곳곳에서 큰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세력은 약화됐지만 플로리다와 조지아주 등 3개 지역이 직격탄을 맞았고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이주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메이저 급인 4등급으로 세력을 키운 허리케인 마이클이 미국 플로리다 북부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열대성 폭풍이던 마이클은 미 본토 상륙을 앞두고 메이저급인 4등급으로 위력이 커졌습니다.
[릭 스콧/플로리다 주지사 : "허리케인 '마이클'은 매우 살인적인 4등급 폭풍입니다. 플로리다 팬핸들 지역을 강타하는 100년 만에 최악의 허리케인입니다."]
마이클은 플로리다에 상륙한 이후 풍속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현재는 1등급으로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플로리다와 조지아, 앨라배마 등 남부 3개 주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30여만 가구가 정전됐고 쓰러진 나무에 주민 1명이 숨졌습니다.
플로리다 재난 당국은 허리케인 경보를 발령한 가운데 해안 저지대 주민 37만 여명에게 강제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체트 왓슨/주민 : "평소 이런 일은 그냥 웃어넘기는 편인데, 이번 허리케인은 직접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여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플로리다 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허리케인 마이클은 시속 22킬로미터 속도로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번 주말쯤 대서양으로 빠져 나갈 것으로 기상당국은 예측했습니다.
지난달 허리케인 '플로렌스'로 최소 3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미국 동남부 지역에 한 달도 채 안 돼 다시 허리케인이 강타하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주한입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마이클이 미국 플로리다에 상륙하면서 곳곳에서 큰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세력은 약화됐지만 플로리다와 조지아주 등 3개 지역이 직격탄을 맞았고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이주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메이저 급인 4등급으로 세력을 키운 허리케인 마이클이 미국 플로리다 북부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열대성 폭풍이던 마이클은 미 본토 상륙을 앞두고 메이저급인 4등급으로 위력이 커졌습니다.
[릭 스콧/플로리다 주지사 : "허리케인 '마이클'은 매우 살인적인 4등급 폭풍입니다. 플로리다 팬핸들 지역을 강타하는 100년 만에 최악의 허리케인입니다."]
마이클은 플로리다에 상륙한 이후 풍속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현재는 1등급으로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플로리다와 조지아, 앨라배마 등 남부 3개 주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30여만 가구가 정전됐고 쓰러진 나무에 주민 1명이 숨졌습니다.
플로리다 재난 당국은 허리케인 경보를 발령한 가운데 해안 저지대 주민 37만 여명에게 강제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체트 왓슨/주민 : "평소 이런 일은 그냥 웃어넘기는 편인데, 이번 허리케인은 직접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여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플로리다 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허리케인 마이클은 시속 22킬로미터 속도로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번 주말쯤 대서양으로 빠져 나갈 것으로 기상당국은 예측했습니다.
지난달 허리케인 '플로렌스'로 최소 3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미국 동남부 지역에 한 달도 채 안 돼 다시 허리케인이 강타하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주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4등급 허리케인’ 마이클, 美 플로리다 상륙…피해 속출
-
- 입력 2018-10-11 12:40:55
- 수정2018-10-11 19:47:00

[앵커]
초강력 허리케인 마이클이 미국 플로리다에 상륙하면서 곳곳에서 큰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세력은 약화됐지만 플로리다와 조지아주 등 3개 지역이 직격탄을 맞았고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이주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메이저 급인 4등급으로 세력을 키운 허리케인 마이클이 미국 플로리다 북부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열대성 폭풍이던 마이클은 미 본토 상륙을 앞두고 메이저급인 4등급으로 위력이 커졌습니다.
[릭 스콧/플로리다 주지사 : "허리케인 '마이클'은 매우 살인적인 4등급 폭풍입니다. 플로리다 팬핸들 지역을 강타하는 100년 만에 최악의 허리케인입니다."]
마이클은 플로리다에 상륙한 이후 풍속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현재는 1등급으로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플로리다와 조지아, 앨라배마 등 남부 3개 주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30여만 가구가 정전됐고 쓰러진 나무에 주민 1명이 숨졌습니다.
플로리다 재난 당국은 허리케인 경보를 발령한 가운데 해안 저지대 주민 37만 여명에게 강제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체트 왓슨/주민 : "평소 이런 일은 그냥 웃어넘기는 편인데, 이번 허리케인은 직접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여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플로리다 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허리케인 마이클은 시속 22킬로미터 속도로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번 주말쯤 대서양으로 빠져 나갈 것으로 기상당국은 예측했습니다.
지난달 허리케인 '플로렌스'로 최소 3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미국 동남부 지역에 한 달도 채 안 돼 다시 허리케인이 강타하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주한입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마이클이 미국 플로리다에 상륙하면서 곳곳에서 큰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세력은 약화됐지만 플로리다와 조지아주 등 3개 지역이 직격탄을 맞았고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이주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메이저 급인 4등급으로 세력을 키운 허리케인 마이클이 미국 플로리다 북부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열대성 폭풍이던 마이클은 미 본토 상륙을 앞두고 메이저급인 4등급으로 위력이 커졌습니다.
[릭 스콧/플로리다 주지사 : "허리케인 '마이클'은 매우 살인적인 4등급 폭풍입니다. 플로리다 팬핸들 지역을 강타하는 100년 만에 최악의 허리케인입니다."]
마이클은 플로리다에 상륙한 이후 풍속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현재는 1등급으로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플로리다와 조지아, 앨라배마 등 남부 3개 주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30여만 가구가 정전됐고 쓰러진 나무에 주민 1명이 숨졌습니다.
플로리다 재난 당국은 허리케인 경보를 발령한 가운데 해안 저지대 주민 37만 여명에게 강제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체트 왓슨/주민 : "평소 이런 일은 그냥 웃어넘기는 편인데, 이번 허리케인은 직접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여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플로리다 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허리케인 마이클은 시속 22킬로미터 속도로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번 주말쯤 대서양으로 빠져 나갈 것으로 기상당국은 예측했습니다.
지난달 허리케인 '플로렌스'로 최소 3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미국 동남부 지역에 한 달도 채 안 돼 다시 허리케인이 강타하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주한입니다.
-
-

이주한 기자 juhan@kbs.co.kr
이주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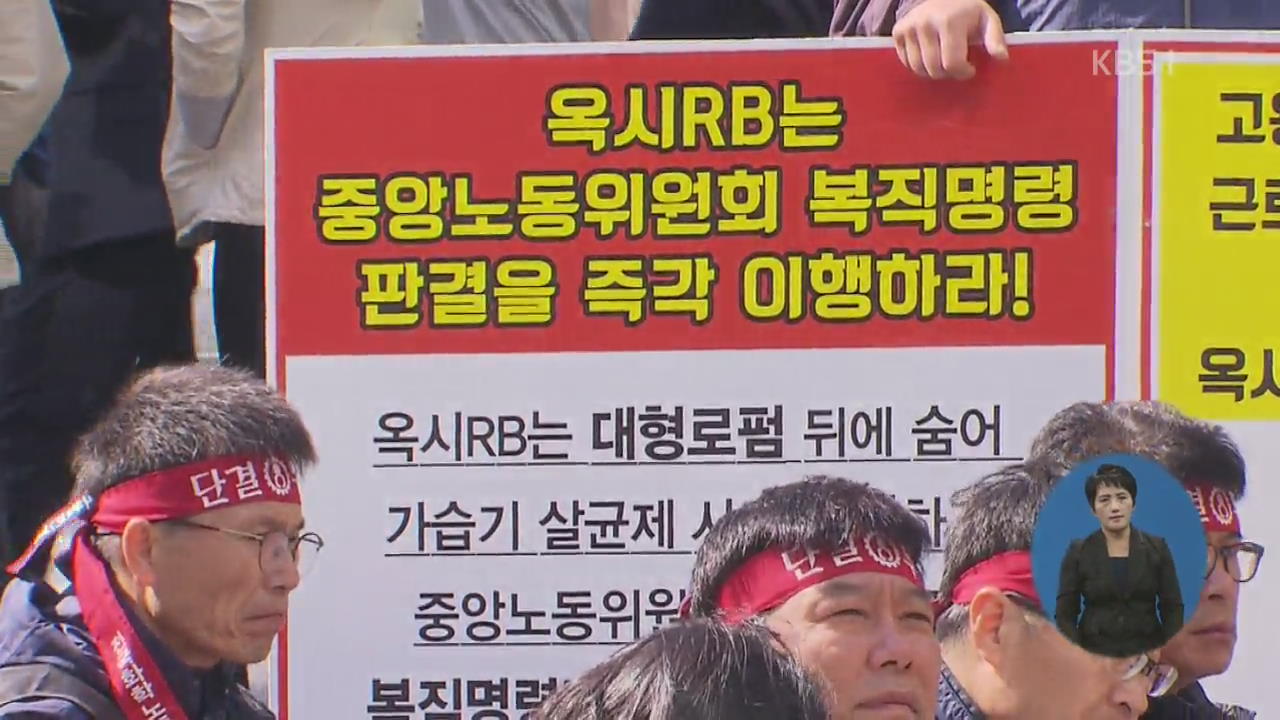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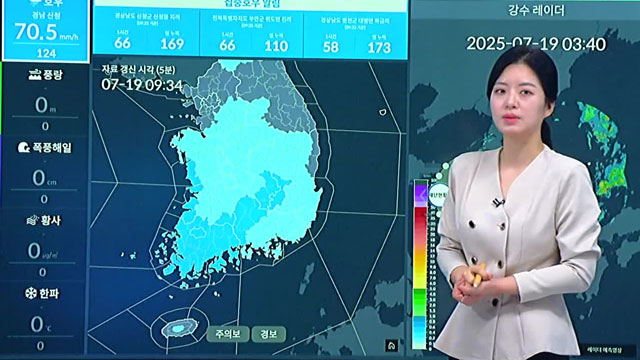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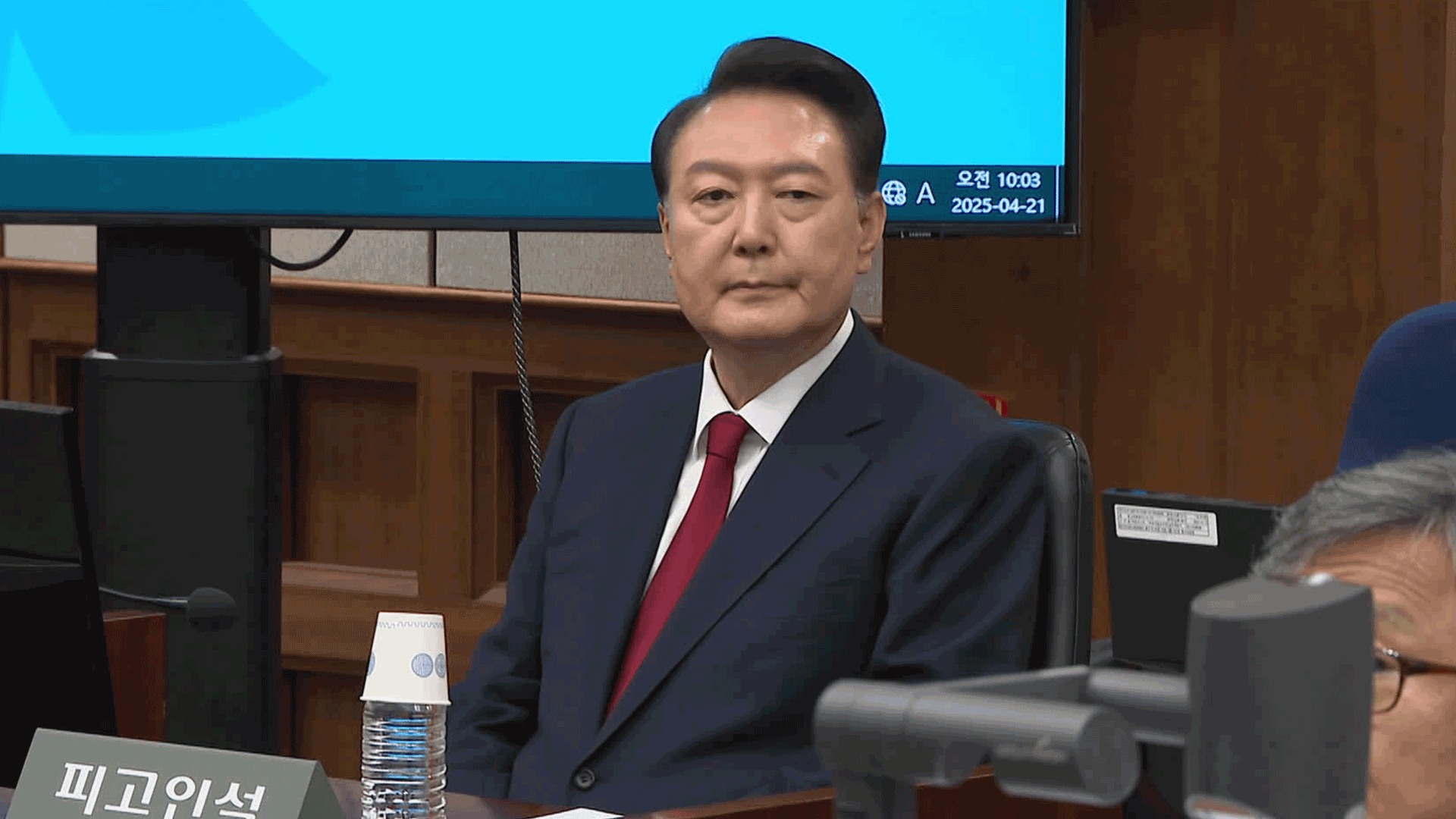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