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새 ‘쇠제비갈매기’, 왜 안동호에?
입력 2018.10.25 (21:41)
수정 2018.10.25 (21: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낙동강 상류 안동호 모래섬에 쇠제비갈매기들이 10년째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닷가에 주로 사는 이 새들이 내륙 깊숙한 민물호수를 찾아온 이유는 뭘까요?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낙동강 최상류를 막아 생긴 경북 안동시 안동호.
그 안의 작은 모래섬에, 부리 끝이 검고 이마가 하얀 낯선 새들이 모여 삽니다.
주로 바닷가 모래밭에 사는 쇠제비갈매기입니다.
낙동강 하구 대규모 서식지가 망가진 뒤, 몇 년 전부터 이곳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백운기/국립중앙과학관 박사/한국조류학회 회장 : "내륙에서 작지만 10여 년 이상 유지해 나가는 새로운 번식지를 개척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60여 쌍이 KBS 다큐멘터리 팀의 무인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먹이는 자생 어종이 아닌 40년 전 이곳에 방류된 외래종, 빙어였습니다.
낯선 환경에서는 알을 낳고 새끼를 돌보는 일도 더 큰 숙제입니다.
낮에 활동하던 바닷가 천적들과 달리 수리부엉이 같은 맹금류가 밤에도 호시탐탐 이들을 노립니다.
바닷가에선 걱정하지 않았던 장맛비도 호숫가에선 재앙입니다.
모래섬 위로 물이 차오르면 날지 못 하는 새끼들만 남습니다.
난개발로 고향을 잃은 바닷새 쇠제비갈매기들이 낯선 민물호수 모래섬에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낙동강 상류 안동호 모래섬에 쇠제비갈매기들이 10년째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닷가에 주로 사는 이 새들이 내륙 깊숙한 민물호수를 찾아온 이유는 뭘까요?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낙동강 최상류를 막아 생긴 경북 안동시 안동호.
그 안의 작은 모래섬에, 부리 끝이 검고 이마가 하얀 낯선 새들이 모여 삽니다.
주로 바닷가 모래밭에 사는 쇠제비갈매기입니다.
낙동강 하구 대규모 서식지가 망가진 뒤, 몇 년 전부터 이곳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백운기/국립중앙과학관 박사/한국조류학회 회장 : "내륙에서 작지만 10여 년 이상 유지해 나가는 새로운 번식지를 개척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60여 쌍이 KBS 다큐멘터리 팀의 무인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먹이는 자생 어종이 아닌 40년 전 이곳에 방류된 외래종, 빙어였습니다.
낯선 환경에서는 알을 낳고 새끼를 돌보는 일도 더 큰 숙제입니다.
낮에 활동하던 바닷가 천적들과 달리 수리부엉이 같은 맹금류가 밤에도 호시탐탐 이들을 노립니다.
바닷가에선 걱정하지 않았던 장맛비도 호숫가에선 재앙입니다.
모래섬 위로 물이 차오르면 날지 못 하는 새끼들만 남습니다.
난개발로 고향을 잃은 바닷새 쇠제비갈매기들이 낯선 민물호수 모래섬에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바닷새 ‘쇠제비갈매기’, 왜 안동호에?
-
- 입력 2018-10-25 21:44:35
- 수정2018-10-25 21:52:01

[앵커]
낙동강 상류 안동호 모래섬에 쇠제비갈매기들이 10년째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닷가에 주로 사는 이 새들이 내륙 깊숙한 민물호수를 찾아온 이유는 뭘까요?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낙동강 최상류를 막아 생긴 경북 안동시 안동호.
그 안의 작은 모래섬에, 부리 끝이 검고 이마가 하얀 낯선 새들이 모여 삽니다.
주로 바닷가 모래밭에 사는 쇠제비갈매기입니다.
낙동강 하구 대규모 서식지가 망가진 뒤, 몇 년 전부터 이곳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백운기/국립중앙과학관 박사/한국조류학회 회장 : "내륙에서 작지만 10여 년 이상 유지해 나가는 새로운 번식지를 개척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60여 쌍이 KBS 다큐멘터리 팀의 무인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먹이는 자생 어종이 아닌 40년 전 이곳에 방류된 외래종, 빙어였습니다.
낯선 환경에서는 알을 낳고 새끼를 돌보는 일도 더 큰 숙제입니다.
낮에 활동하던 바닷가 천적들과 달리 수리부엉이 같은 맹금류가 밤에도 호시탐탐 이들을 노립니다.
바닷가에선 걱정하지 않았던 장맛비도 호숫가에선 재앙입니다.
모래섬 위로 물이 차오르면 날지 못 하는 새끼들만 남습니다.
난개발로 고향을 잃은 바닷새 쇠제비갈매기들이 낯선 민물호수 모래섬에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낙동강 상류 안동호 모래섬에 쇠제비갈매기들이 10년째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닷가에 주로 사는 이 새들이 내륙 깊숙한 민물호수를 찾아온 이유는 뭘까요?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낙동강 최상류를 막아 생긴 경북 안동시 안동호.
그 안의 작은 모래섬에, 부리 끝이 검고 이마가 하얀 낯선 새들이 모여 삽니다.
주로 바닷가 모래밭에 사는 쇠제비갈매기입니다.
낙동강 하구 대규모 서식지가 망가진 뒤, 몇 년 전부터 이곳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백운기/국립중앙과학관 박사/한국조류학회 회장 : "내륙에서 작지만 10여 년 이상 유지해 나가는 새로운 번식지를 개척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60여 쌍이 KBS 다큐멘터리 팀의 무인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먹이는 자생 어종이 아닌 40년 전 이곳에 방류된 외래종, 빙어였습니다.
낯선 환경에서는 알을 낳고 새끼를 돌보는 일도 더 큰 숙제입니다.
낮에 활동하던 바닷가 천적들과 달리 수리부엉이 같은 맹금류가 밤에도 호시탐탐 이들을 노립니다.
바닷가에선 걱정하지 않았던 장맛비도 호숫가에선 재앙입니다.
모래섬 위로 물이 차오르면 날지 못 하는 새끼들만 남습니다.
난개발로 고향을 잃은 바닷새 쇠제비갈매기들이 낯선 민물호수 모래섬에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
-

류란 기자 nany@kbs.co.kr
류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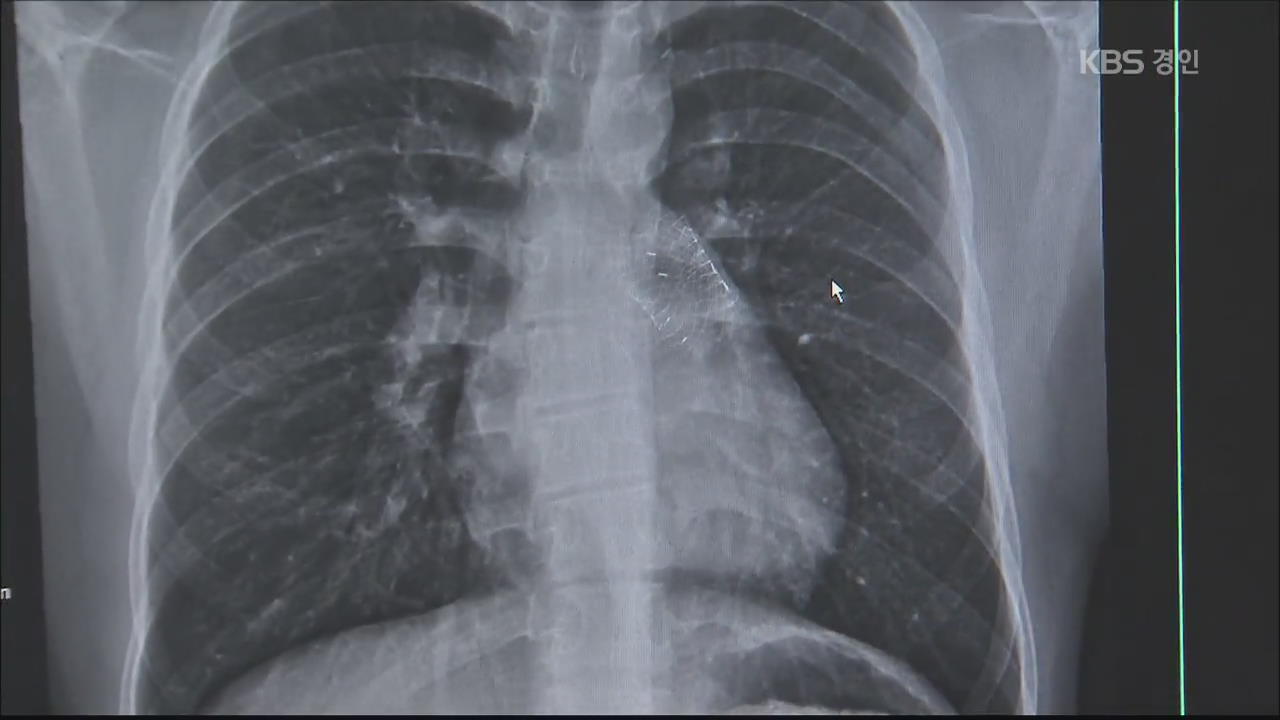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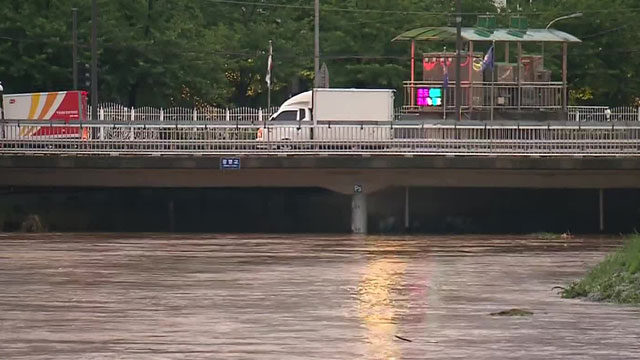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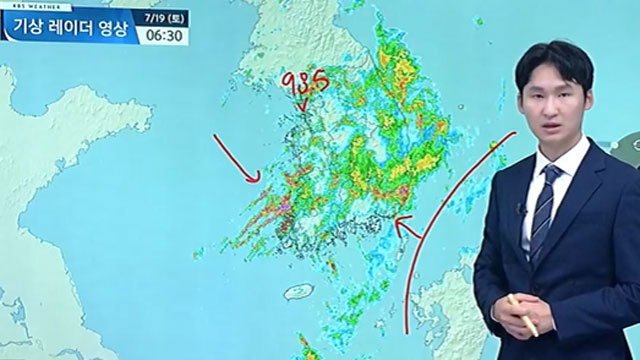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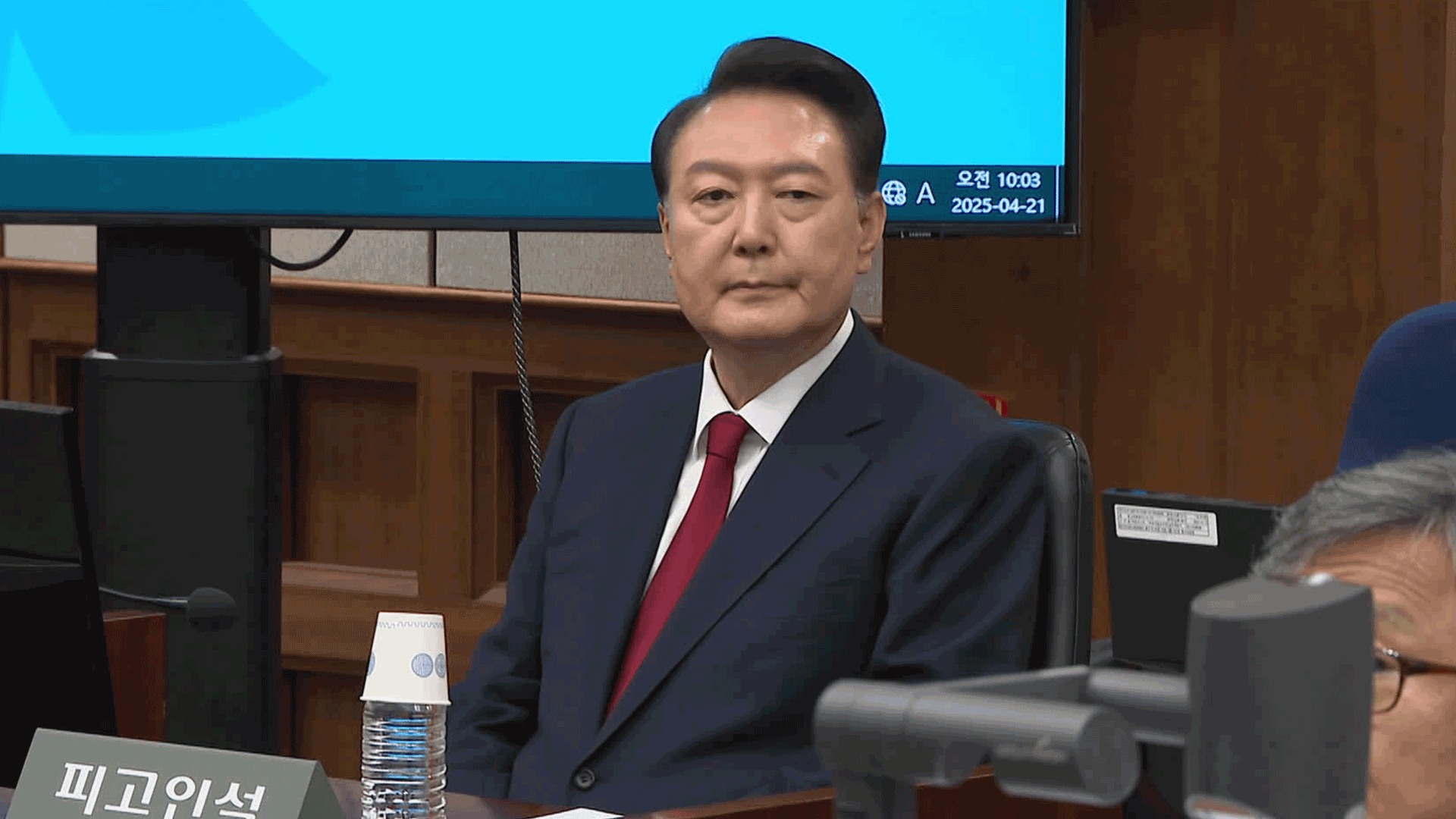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