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 국민연금 내는 나이를 5년 늘리자고? 이유와 효과는?
입력 2021.11.09 (19:36)
수정 2021.11.09 (19: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뉴스를 쉽고 자세히! 친절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내는 기간을 늘리자는 제안이 나왔는데, 그 내용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아무것도 없으세요, 자식 셋 키우시느라 노후대책 안 되어 있고요."]
'노년에는 자식보다 연금이 효자다', 은퇴 뒤 자산이 많지 않은 노후에 국민 연금에 기댈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입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나이에 매달 꼬박꼬박 돈을 내고,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돈을 받는 공적 연금제도죠.
내는 나이는 만 59세, 받는 나이는 만 64세입니다.
그런데, 최근 만 59세로 맞춰진 이 의무가입 연령을 연장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보험료 내는 나이를 만 59세에서 64세로 5년 늘리자는 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안입니다.
[이다미/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98년에 1차 국민연금 개혁을 했을 때보다 점점 최근으로 오면서 고령자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는 노동시장에서의 변화를 꼽을 수 있을 텐데요."]
국민연금이 처음 시작될 당시 연금을 받는 나이가 60세로 설계됐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을 계기로 2013년부터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 2033년에는 65세까지 늦춰지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내야 하는 의무가입 나이는 여전히 만 59세에 고정돼있습니다.
특별한 수입이 없으면 5년 간 소득 단절도 발생합니다.
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공적연금의 기본 원칙에 맞게 보험료 납입 기간이 끝나는 동시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자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사실 국민연금의 가입상한 연령을 연장하자는 이야기는 2018년에도 나왔는데요.
당시 많은 반대에 부딪혀 시도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60대에 들어가면 소득이 감소돼 보험료 내기가 힘들어진다는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난 10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60세에서 64세 취업자 중 상용직 임금 근로자 비율은 3배 가까이 증가했고, 65세까지 보험료를 더 내겠다는 임의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어서 가입상한 연령을 높이는 부담이 낮아졌다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가입상한연령을 연장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들이 받는 연금액은 많아지는데요.
근로자들은 보험료를 사용자와 나눠 낼 수 있어서 총액으로 따져보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적게 내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 직원 연금의 절반을 내야 하는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들의 고용이 연장될 경우 신규채용이 줄어들어서 청년 실업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다미/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연금제도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노동시장과의 정합성을 갖추어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더 큰 틀에서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다수 연금 선진국은 연금 수급연령과 가입 상한연령을 연계해 연금 수급연령보다 가입 상한연령을 높게 정해놓고 있는데요.
독일, 스웨덴, 캐나다는 연금 가입 상한연령이 65세 미만이거나 70세 미만이고 수급개시연령은 65세로 맞춰놓았습니다.
미국의 경우 아예 가입 상한연령을 따로 정해두지 않고 연금 수급개시연령만 66세로 잡아놓았습니다.
사실, 국민연금 가입상한 연령을 높아지는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등의 문제와도 얽혀있어 풀어야할 숙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또 국민 여론은 어디로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친절한 뉴스 양재희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내는 기간을 늘리자는 제안이 나왔는데, 그 내용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아무것도 없으세요, 자식 셋 키우시느라 노후대책 안 되어 있고요."]
'노년에는 자식보다 연금이 효자다', 은퇴 뒤 자산이 많지 않은 노후에 국민 연금에 기댈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입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나이에 매달 꼬박꼬박 돈을 내고,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돈을 받는 공적 연금제도죠.
내는 나이는 만 59세, 받는 나이는 만 64세입니다.
그런데, 최근 만 59세로 맞춰진 이 의무가입 연령을 연장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보험료 내는 나이를 만 59세에서 64세로 5년 늘리자는 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안입니다.
[이다미/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98년에 1차 국민연금 개혁을 했을 때보다 점점 최근으로 오면서 고령자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는 노동시장에서의 변화를 꼽을 수 있을 텐데요."]
국민연금이 처음 시작될 당시 연금을 받는 나이가 60세로 설계됐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을 계기로 2013년부터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 2033년에는 65세까지 늦춰지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내야 하는 의무가입 나이는 여전히 만 59세에 고정돼있습니다.
특별한 수입이 없으면 5년 간 소득 단절도 발생합니다.
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공적연금의 기본 원칙에 맞게 보험료 납입 기간이 끝나는 동시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자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사실 국민연금의 가입상한 연령을 연장하자는 이야기는 2018년에도 나왔는데요.
당시 많은 반대에 부딪혀 시도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60대에 들어가면 소득이 감소돼 보험료 내기가 힘들어진다는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난 10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60세에서 64세 취업자 중 상용직 임금 근로자 비율은 3배 가까이 증가했고, 65세까지 보험료를 더 내겠다는 임의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어서 가입상한 연령을 높이는 부담이 낮아졌다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가입상한연령을 연장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들이 받는 연금액은 많아지는데요.
근로자들은 보험료를 사용자와 나눠 낼 수 있어서 총액으로 따져보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적게 내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 직원 연금의 절반을 내야 하는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들의 고용이 연장될 경우 신규채용이 줄어들어서 청년 실업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다미/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연금제도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노동시장과의 정합성을 갖추어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더 큰 틀에서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다수 연금 선진국은 연금 수급연령과 가입 상한연령을 연계해 연금 수급연령보다 가입 상한연령을 높게 정해놓고 있는데요.
독일, 스웨덴, 캐나다는 연금 가입 상한연령이 65세 미만이거나 70세 미만이고 수급개시연령은 65세로 맞춰놓았습니다.
미국의 경우 아예 가입 상한연령을 따로 정해두지 않고 연금 수급개시연령만 66세로 잡아놓았습니다.
사실, 국민연금 가입상한 연령을 높아지는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등의 문제와도 얽혀있어 풀어야할 숙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또 국민 여론은 어디로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친절한 뉴스 양재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친절한 뉴스] 국민연금 내는 나이를 5년 늘리자고? 이유와 효과는?
-
- 입력 2021-11-09 19:36:58
- 수정2021-11-09 19:57: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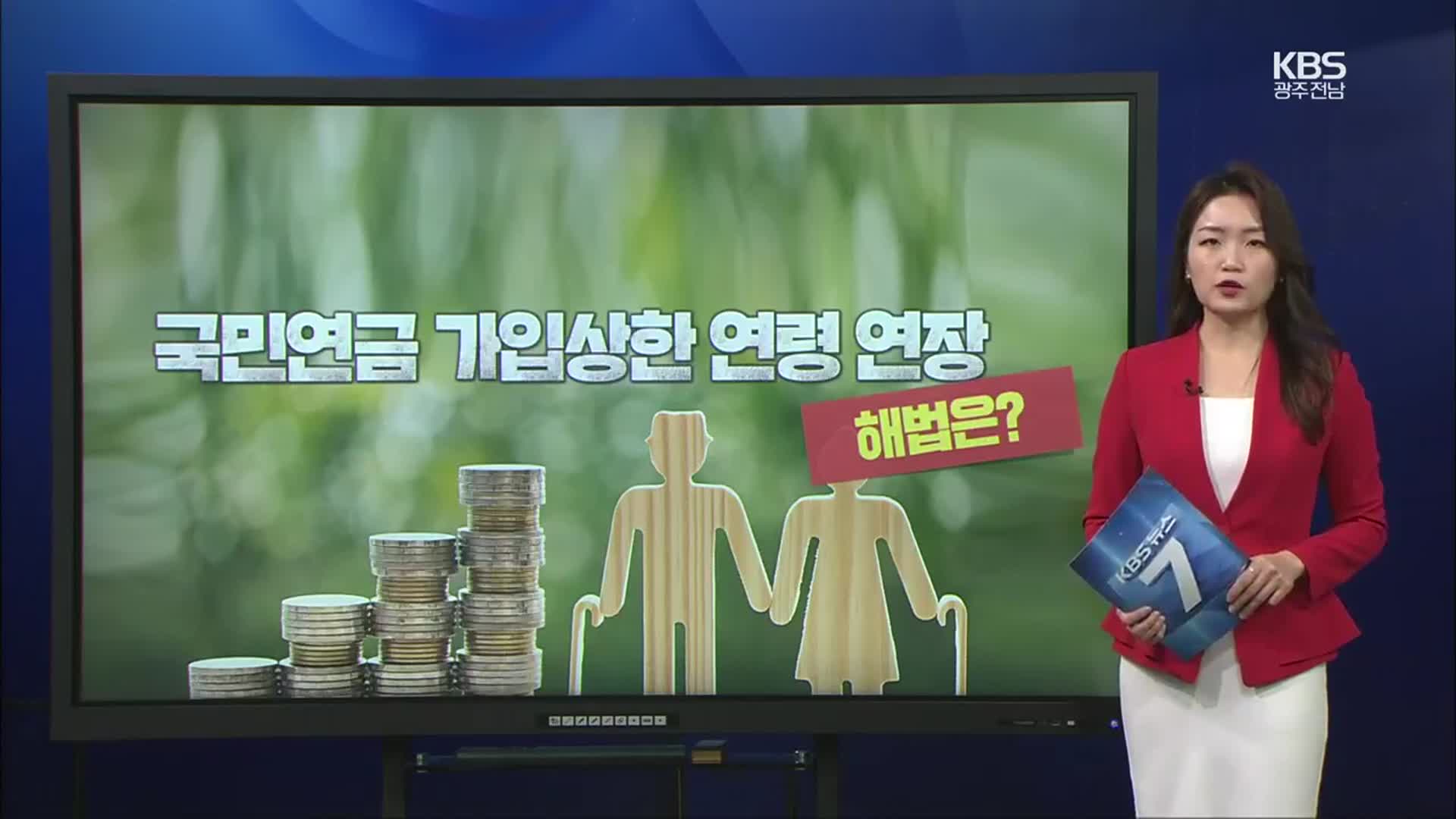
어려운 뉴스를 쉽고 자세히! 친절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내는 기간을 늘리자는 제안이 나왔는데, 그 내용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아무것도 없으세요, 자식 셋 키우시느라 노후대책 안 되어 있고요."]
'노년에는 자식보다 연금이 효자다', 은퇴 뒤 자산이 많지 않은 노후에 국민 연금에 기댈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입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나이에 매달 꼬박꼬박 돈을 내고,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돈을 받는 공적 연금제도죠.
내는 나이는 만 59세, 받는 나이는 만 64세입니다.
그런데, 최근 만 59세로 맞춰진 이 의무가입 연령을 연장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보험료 내는 나이를 만 59세에서 64세로 5년 늘리자는 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안입니다.
[이다미/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98년에 1차 국민연금 개혁을 했을 때보다 점점 최근으로 오면서 고령자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는 노동시장에서의 변화를 꼽을 수 있을 텐데요."]
국민연금이 처음 시작될 당시 연금을 받는 나이가 60세로 설계됐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을 계기로 2013년부터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 2033년에는 65세까지 늦춰지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내야 하는 의무가입 나이는 여전히 만 59세에 고정돼있습니다.
특별한 수입이 없으면 5년 간 소득 단절도 발생합니다.
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공적연금의 기본 원칙에 맞게 보험료 납입 기간이 끝나는 동시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자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사실 국민연금의 가입상한 연령을 연장하자는 이야기는 2018년에도 나왔는데요.
당시 많은 반대에 부딪혀 시도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60대에 들어가면 소득이 감소돼 보험료 내기가 힘들어진다는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난 10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60세에서 64세 취업자 중 상용직 임금 근로자 비율은 3배 가까이 증가했고, 65세까지 보험료를 더 내겠다는 임의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어서 가입상한 연령을 높이는 부담이 낮아졌다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가입상한연령을 연장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들이 받는 연금액은 많아지는데요.
근로자들은 보험료를 사용자와 나눠 낼 수 있어서 총액으로 따져보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적게 내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 직원 연금의 절반을 내야 하는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들의 고용이 연장될 경우 신규채용이 줄어들어서 청년 실업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다미/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연금제도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노동시장과의 정합성을 갖추어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더 큰 틀에서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다수 연금 선진국은 연금 수급연령과 가입 상한연령을 연계해 연금 수급연령보다 가입 상한연령을 높게 정해놓고 있는데요.
독일, 스웨덴, 캐나다는 연금 가입 상한연령이 65세 미만이거나 70세 미만이고 수급개시연령은 65세로 맞춰놓았습니다.
미국의 경우 아예 가입 상한연령을 따로 정해두지 않고 연금 수급개시연령만 66세로 잡아놓았습니다.
사실, 국민연금 가입상한 연령을 높아지는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등의 문제와도 얽혀있어 풀어야할 숙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또 국민 여론은 어디로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친절한 뉴스 양재희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내는 기간을 늘리자는 제안이 나왔는데, 그 내용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아무것도 없으세요, 자식 셋 키우시느라 노후대책 안 되어 있고요."]
'노년에는 자식보다 연금이 효자다', 은퇴 뒤 자산이 많지 않은 노후에 국민 연금에 기댈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입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나이에 매달 꼬박꼬박 돈을 내고,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돈을 받는 공적 연금제도죠.
내는 나이는 만 59세, 받는 나이는 만 64세입니다.
그런데, 최근 만 59세로 맞춰진 이 의무가입 연령을 연장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보험료 내는 나이를 만 59세에서 64세로 5년 늘리자는 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안입니다.
[이다미/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98년에 1차 국민연금 개혁을 했을 때보다 점점 최근으로 오면서 고령자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는 노동시장에서의 변화를 꼽을 수 있을 텐데요."]
국민연금이 처음 시작될 당시 연금을 받는 나이가 60세로 설계됐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을 계기로 2013년부터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 2033년에는 65세까지 늦춰지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내야 하는 의무가입 나이는 여전히 만 59세에 고정돼있습니다.
특별한 수입이 없으면 5년 간 소득 단절도 발생합니다.
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공적연금의 기본 원칙에 맞게 보험료 납입 기간이 끝나는 동시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자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사실 국민연금의 가입상한 연령을 연장하자는 이야기는 2018년에도 나왔는데요.
당시 많은 반대에 부딪혀 시도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60대에 들어가면 소득이 감소돼 보험료 내기가 힘들어진다는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난 10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60세에서 64세 취업자 중 상용직 임금 근로자 비율은 3배 가까이 증가했고, 65세까지 보험료를 더 내겠다는 임의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어서 가입상한 연령을 높이는 부담이 낮아졌다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가입상한연령을 연장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들이 받는 연금액은 많아지는데요.
근로자들은 보험료를 사용자와 나눠 낼 수 있어서 총액으로 따져보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적게 내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 직원 연금의 절반을 내야 하는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들의 고용이 연장될 경우 신규채용이 줄어들어서 청년 실업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다미/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연금제도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노동시장과의 정합성을 갖추어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더 큰 틀에서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다수 연금 선진국은 연금 수급연령과 가입 상한연령을 연계해 연금 수급연령보다 가입 상한연령을 높게 정해놓고 있는데요.
독일, 스웨덴, 캐나다는 연금 가입 상한연령이 65세 미만이거나 70세 미만이고 수급개시연령은 65세로 맞춰놓았습니다.
미국의 경우 아예 가입 상한연령을 따로 정해두지 않고 연금 수급개시연령만 66세로 잡아놓았습니다.
사실, 국민연금 가입상한 연령을 높아지는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등의 문제와도 얽혀있어 풀어야할 숙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또 국민 여론은 어디로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친절한 뉴스 양재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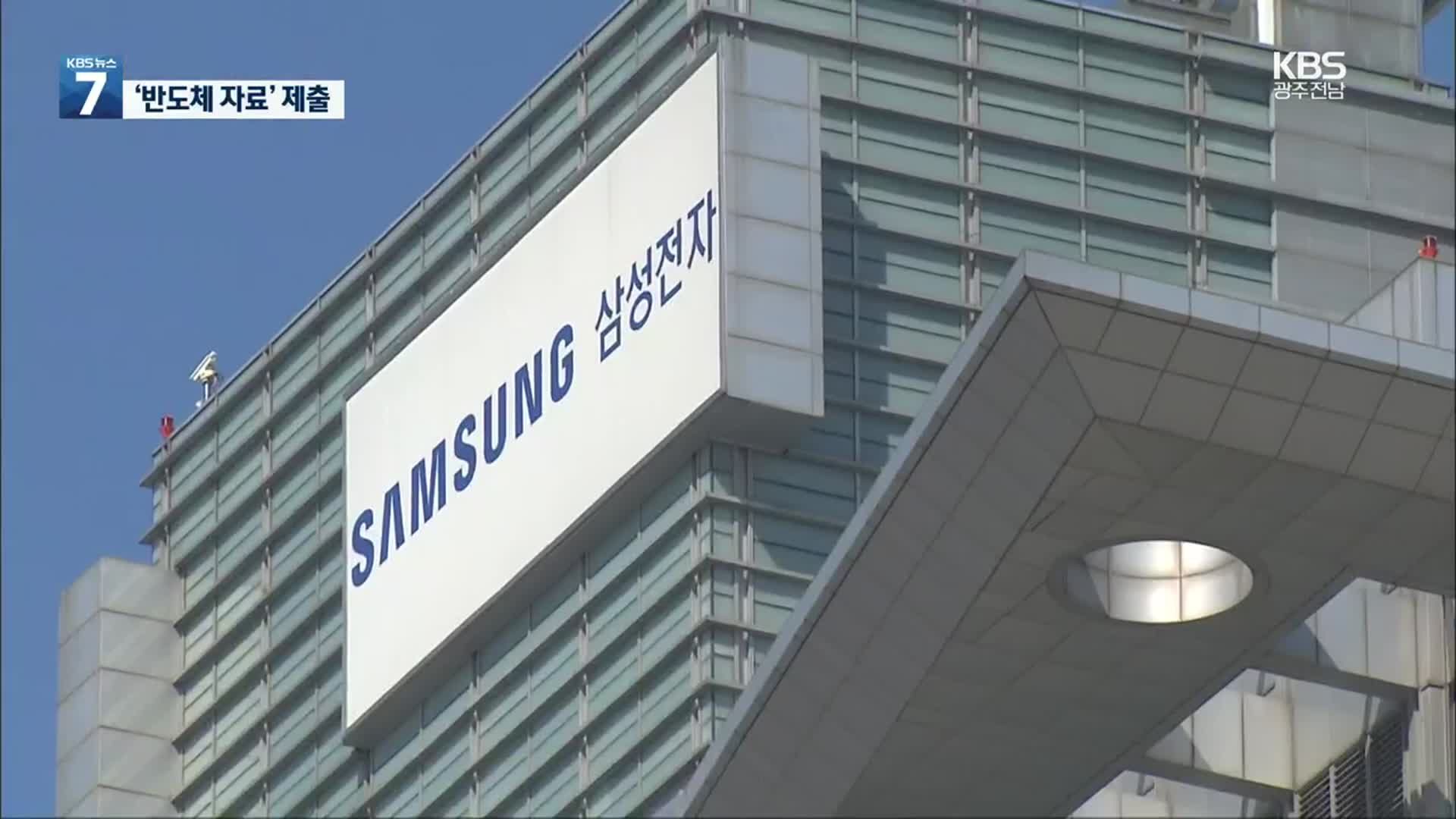
![[간추린 뉴스] 광주시, 단절된 도심공원 연결 ‘보행육교’ 조성 외](https://news.kbs.co.kr/data/news/title_image/newsmp4/gwangju/news7/2021/11/09/160_5320968.jpg)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