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人] 전통 잇는 섬세한 ‘손끝 예술’…배순화 매듭장
입력 2022.01.11 (19:31)
수정 2022.01.11 (22: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한복에 멋을 더하는 전통 장신구 노리개는 섬세한 문양의 매듭으로 그 아름다움이 커지는데요,
전통 매듭을 지키고 연구해 온 창원시 공예 분야 유일한 무형문화재, 배순화 매듭장을 경남인에서 만나보시죠.
[리포트]
사대부와 평민 여성들이 쓰던 노리개.
발을 고정하는 발걸이, 한복을 거는 횟대도 매듭을 만나 더 특별해집니다.
["임금님한테 받은 교지, 요즘 말로 치면 임명장…."]
실을 짜고 맺고 조이며 장인의 손끝에서 나오는 예술.
배순화 매듭장은 시간을 이어 전통을 직조합니다.
다양한 생활도구와 장신구를 볼 수 있는 전통매듭 전수관입니다.
물건을 고정하고 운반하는 끈에 장식기능이 더해지면서, 매듭은 공예로 승화됐는데요,
이곳의 작품들은 배순화 매듭장이 직접 고증해 재현했습니다.
[배순화/77/매듭장 : "옛날에 선비들이 외출할 때 도포 밑에 겨드랑이 밑에 달고 다니다가 목이 마르면 우물에서 물 떠먹는 조롱박 바가지…."]
배순화 매듭장은 깃발이나 가마, 옷에 다는 매듭 장식 '유소'로 2007년 경남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흥선대원군의 부친 남연군의 묘를 이장할 때 사용한 남은들상여 재현에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한글 자음을 본 떠 만든 이 글자 매듭도 직접 고안한 작품입니다.
["국화매듭을 방석처럼 반듯하게 엮어서 짠 건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80년도에서 90년도까지 열네 자를 연구한 겁니다."]
매듭은 하얀 명주실을 염색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직접 재배한 쪽으로 천연염색을 고집합니다.
["200년 전의 기법을 쓰고 재료를 만들어내려면 다 이거 천연염색을 해야지…."]
이 색색의 명주실 타래도 모두 천연염료로 물들인 겁니다.
매듭에 쓸 실 한 올도 오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데요,
용도에 따라 가닥을 만든 실은 ‘다회틀’에 얹어 끈으로 만듭니다.
종일 작업해도 끈 1m 만들기가 힘들 만큼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데요,
완성된 끈을 엮고 죄어 매듭을 만드는 전 과정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매듭에 달 술을 만드는 데도 수십 번의 공정이 필요합니다.
[배순화/매듭장 : "이렇게 바짝 당겨서 매어 일주일을 말린 뒤 풀어서 딸기술도 만들고 봉술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17살에 편물기술을 배운 소녀는 손뜨개를 하다 매듭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40년 전 운영하던 편물점, 그때나 지금이나 실을 보면 마냥 행복합니다.
[배종은/편물점 운영 : "전통매듭을 이어서 우리 대를 잇기 위해서 해주는 데 대해선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지난 1980년 매듭연구소를 연 뒤 40여 년을 매듭과 함께했습니다.
개화기 후 수요가 급감하면서 매듭 장인도 자취를 감췄는데요,
어렵게 맥을 이어온 만큼 매듭을 배우려는 제자들이 고맙습니다.
[허채윤/제자/중1 : "결과물을 보고 성취감 그런 게 너무 좋아서 계속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정영희/제자 : "이걸 하면 빠르다는 거 자체를 잊어버리게 돼요."]
현재는 조선시대 전통가마 재현에 열중하고 있는데요,
가마 장식 매듭을 만드는 데 1년이 걸리지만 전통을 잇는 소중한 작업입니다.
[배순화/매듭장 : "이건 우리 경남의 유물이거든요, 이 가마가. 이걸 내가 안 하면 누가 할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왔듯, 남은 삶도 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배순화/매듭장 : "평생을 실하고 매듭이 좋아서 50년을 넘게 잠 안 자고 밥 안 먹고 이렇게 했던 전적을 볼 때 이 매듭 끈 짜다가 죽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실과 한 몸이 되어 매듭을 엮어 온 장인의 손끝은 전통과 현대를 잇는 견고한 연결고리입니다.
한복에 멋을 더하는 전통 장신구 노리개는 섬세한 문양의 매듭으로 그 아름다움이 커지는데요,
전통 매듭을 지키고 연구해 온 창원시 공예 분야 유일한 무형문화재, 배순화 매듭장을 경남인에서 만나보시죠.
[리포트]
사대부와 평민 여성들이 쓰던 노리개.
발을 고정하는 발걸이, 한복을 거는 횟대도 매듭을 만나 더 특별해집니다.
["임금님한테 받은 교지, 요즘 말로 치면 임명장…."]
실을 짜고 맺고 조이며 장인의 손끝에서 나오는 예술.
배순화 매듭장은 시간을 이어 전통을 직조합니다.
다양한 생활도구와 장신구를 볼 수 있는 전통매듭 전수관입니다.
물건을 고정하고 운반하는 끈에 장식기능이 더해지면서, 매듭은 공예로 승화됐는데요,
이곳의 작품들은 배순화 매듭장이 직접 고증해 재현했습니다.
[배순화/77/매듭장 : "옛날에 선비들이 외출할 때 도포 밑에 겨드랑이 밑에 달고 다니다가 목이 마르면 우물에서 물 떠먹는 조롱박 바가지…."]
배순화 매듭장은 깃발이나 가마, 옷에 다는 매듭 장식 '유소'로 2007년 경남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흥선대원군의 부친 남연군의 묘를 이장할 때 사용한 남은들상여 재현에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한글 자음을 본 떠 만든 이 글자 매듭도 직접 고안한 작품입니다.
["국화매듭을 방석처럼 반듯하게 엮어서 짠 건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80년도에서 90년도까지 열네 자를 연구한 겁니다."]
매듭은 하얀 명주실을 염색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직접 재배한 쪽으로 천연염색을 고집합니다.
["200년 전의 기법을 쓰고 재료를 만들어내려면 다 이거 천연염색을 해야지…."]
이 색색의 명주실 타래도 모두 천연염료로 물들인 겁니다.
매듭에 쓸 실 한 올도 오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데요,
용도에 따라 가닥을 만든 실은 ‘다회틀’에 얹어 끈으로 만듭니다.
종일 작업해도 끈 1m 만들기가 힘들 만큼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데요,
완성된 끈을 엮고 죄어 매듭을 만드는 전 과정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매듭에 달 술을 만드는 데도 수십 번의 공정이 필요합니다.
[배순화/매듭장 : "이렇게 바짝 당겨서 매어 일주일을 말린 뒤 풀어서 딸기술도 만들고 봉술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17살에 편물기술을 배운 소녀는 손뜨개를 하다 매듭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40년 전 운영하던 편물점, 그때나 지금이나 실을 보면 마냥 행복합니다.
[배종은/편물점 운영 : "전통매듭을 이어서 우리 대를 잇기 위해서 해주는 데 대해선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지난 1980년 매듭연구소를 연 뒤 40여 년을 매듭과 함께했습니다.
개화기 후 수요가 급감하면서 매듭 장인도 자취를 감췄는데요,
어렵게 맥을 이어온 만큼 매듭을 배우려는 제자들이 고맙습니다.
[허채윤/제자/중1 : "결과물을 보고 성취감 그런 게 너무 좋아서 계속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정영희/제자 : "이걸 하면 빠르다는 거 자체를 잊어버리게 돼요."]
현재는 조선시대 전통가마 재현에 열중하고 있는데요,
가마 장식 매듭을 만드는 데 1년이 걸리지만 전통을 잇는 소중한 작업입니다.
[배순화/매듭장 : "이건 우리 경남의 유물이거든요, 이 가마가. 이걸 내가 안 하면 누가 할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왔듯, 남은 삶도 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배순화/매듭장 : "평생을 실하고 매듭이 좋아서 50년을 넘게 잠 안 자고 밥 안 먹고 이렇게 했던 전적을 볼 때 이 매듭 끈 짜다가 죽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실과 한 몸이 되어 매듭을 엮어 온 장인의 손끝은 전통과 현대를 잇는 견고한 연결고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남人] 전통 잇는 섬세한 ‘손끝 예술’…배순화 매듭장
-
- 입력 2022-01-11 19:31:12
- 수정2022-01-11 22:24:32

[앵커]
한복에 멋을 더하는 전통 장신구 노리개는 섬세한 문양의 매듭으로 그 아름다움이 커지는데요,
전통 매듭을 지키고 연구해 온 창원시 공예 분야 유일한 무형문화재, 배순화 매듭장을 경남인에서 만나보시죠.
[리포트]
사대부와 평민 여성들이 쓰던 노리개.
발을 고정하는 발걸이, 한복을 거는 횟대도 매듭을 만나 더 특별해집니다.
["임금님한테 받은 교지, 요즘 말로 치면 임명장…."]
실을 짜고 맺고 조이며 장인의 손끝에서 나오는 예술.
배순화 매듭장은 시간을 이어 전통을 직조합니다.
다양한 생활도구와 장신구를 볼 수 있는 전통매듭 전수관입니다.
물건을 고정하고 운반하는 끈에 장식기능이 더해지면서, 매듭은 공예로 승화됐는데요,
이곳의 작품들은 배순화 매듭장이 직접 고증해 재현했습니다.
[배순화/77/매듭장 : "옛날에 선비들이 외출할 때 도포 밑에 겨드랑이 밑에 달고 다니다가 목이 마르면 우물에서 물 떠먹는 조롱박 바가지…."]
배순화 매듭장은 깃발이나 가마, 옷에 다는 매듭 장식 '유소'로 2007년 경남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흥선대원군의 부친 남연군의 묘를 이장할 때 사용한 남은들상여 재현에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한글 자음을 본 떠 만든 이 글자 매듭도 직접 고안한 작품입니다.
["국화매듭을 방석처럼 반듯하게 엮어서 짠 건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80년도에서 90년도까지 열네 자를 연구한 겁니다."]
매듭은 하얀 명주실을 염색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직접 재배한 쪽으로 천연염색을 고집합니다.
["200년 전의 기법을 쓰고 재료를 만들어내려면 다 이거 천연염색을 해야지…."]
이 색색의 명주실 타래도 모두 천연염료로 물들인 겁니다.
매듭에 쓸 실 한 올도 오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데요,
용도에 따라 가닥을 만든 실은 ‘다회틀’에 얹어 끈으로 만듭니다.
종일 작업해도 끈 1m 만들기가 힘들 만큼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데요,
완성된 끈을 엮고 죄어 매듭을 만드는 전 과정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매듭에 달 술을 만드는 데도 수십 번의 공정이 필요합니다.
[배순화/매듭장 : "이렇게 바짝 당겨서 매어 일주일을 말린 뒤 풀어서 딸기술도 만들고 봉술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17살에 편물기술을 배운 소녀는 손뜨개를 하다 매듭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40년 전 운영하던 편물점, 그때나 지금이나 실을 보면 마냥 행복합니다.
[배종은/편물점 운영 : "전통매듭을 이어서 우리 대를 잇기 위해서 해주는 데 대해선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지난 1980년 매듭연구소를 연 뒤 40여 년을 매듭과 함께했습니다.
개화기 후 수요가 급감하면서 매듭 장인도 자취를 감췄는데요,
어렵게 맥을 이어온 만큼 매듭을 배우려는 제자들이 고맙습니다.
[허채윤/제자/중1 : "결과물을 보고 성취감 그런 게 너무 좋아서 계속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정영희/제자 : "이걸 하면 빠르다는 거 자체를 잊어버리게 돼요."]
현재는 조선시대 전통가마 재현에 열중하고 있는데요,
가마 장식 매듭을 만드는 데 1년이 걸리지만 전통을 잇는 소중한 작업입니다.
[배순화/매듭장 : "이건 우리 경남의 유물이거든요, 이 가마가. 이걸 내가 안 하면 누가 할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왔듯, 남은 삶도 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배순화/매듭장 : "평생을 실하고 매듭이 좋아서 50년을 넘게 잠 안 자고 밥 안 먹고 이렇게 했던 전적을 볼 때 이 매듭 끈 짜다가 죽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실과 한 몸이 되어 매듭을 엮어 온 장인의 손끝은 전통과 현대를 잇는 견고한 연결고리입니다.
한복에 멋을 더하는 전통 장신구 노리개는 섬세한 문양의 매듭으로 그 아름다움이 커지는데요,
전통 매듭을 지키고 연구해 온 창원시 공예 분야 유일한 무형문화재, 배순화 매듭장을 경남인에서 만나보시죠.
[리포트]
사대부와 평민 여성들이 쓰던 노리개.
발을 고정하는 발걸이, 한복을 거는 횟대도 매듭을 만나 더 특별해집니다.
["임금님한테 받은 교지, 요즘 말로 치면 임명장…."]
실을 짜고 맺고 조이며 장인의 손끝에서 나오는 예술.
배순화 매듭장은 시간을 이어 전통을 직조합니다.
다양한 생활도구와 장신구를 볼 수 있는 전통매듭 전수관입니다.
물건을 고정하고 운반하는 끈에 장식기능이 더해지면서, 매듭은 공예로 승화됐는데요,
이곳의 작품들은 배순화 매듭장이 직접 고증해 재현했습니다.
[배순화/77/매듭장 : "옛날에 선비들이 외출할 때 도포 밑에 겨드랑이 밑에 달고 다니다가 목이 마르면 우물에서 물 떠먹는 조롱박 바가지…."]
배순화 매듭장은 깃발이나 가마, 옷에 다는 매듭 장식 '유소'로 2007년 경남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흥선대원군의 부친 남연군의 묘를 이장할 때 사용한 남은들상여 재현에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한글 자음을 본 떠 만든 이 글자 매듭도 직접 고안한 작품입니다.
["국화매듭을 방석처럼 반듯하게 엮어서 짠 건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80년도에서 90년도까지 열네 자를 연구한 겁니다."]
매듭은 하얀 명주실을 염색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직접 재배한 쪽으로 천연염색을 고집합니다.
["200년 전의 기법을 쓰고 재료를 만들어내려면 다 이거 천연염색을 해야지…."]
이 색색의 명주실 타래도 모두 천연염료로 물들인 겁니다.
매듭에 쓸 실 한 올도 오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데요,
용도에 따라 가닥을 만든 실은 ‘다회틀’에 얹어 끈으로 만듭니다.
종일 작업해도 끈 1m 만들기가 힘들 만큼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데요,
완성된 끈을 엮고 죄어 매듭을 만드는 전 과정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매듭에 달 술을 만드는 데도 수십 번의 공정이 필요합니다.
[배순화/매듭장 : "이렇게 바짝 당겨서 매어 일주일을 말린 뒤 풀어서 딸기술도 만들고 봉술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17살에 편물기술을 배운 소녀는 손뜨개를 하다 매듭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40년 전 운영하던 편물점, 그때나 지금이나 실을 보면 마냥 행복합니다.
[배종은/편물점 운영 : "전통매듭을 이어서 우리 대를 잇기 위해서 해주는 데 대해선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지난 1980년 매듭연구소를 연 뒤 40여 년을 매듭과 함께했습니다.
개화기 후 수요가 급감하면서 매듭 장인도 자취를 감췄는데요,
어렵게 맥을 이어온 만큼 매듭을 배우려는 제자들이 고맙습니다.
[허채윤/제자/중1 : "결과물을 보고 성취감 그런 게 너무 좋아서 계속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정영희/제자 : "이걸 하면 빠르다는 거 자체를 잊어버리게 돼요."]
현재는 조선시대 전통가마 재현에 열중하고 있는데요,
가마 장식 매듭을 만드는 데 1년이 걸리지만 전통을 잇는 소중한 작업입니다.
[배순화/매듭장 : "이건 우리 경남의 유물이거든요, 이 가마가. 이걸 내가 안 하면 누가 할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왔듯, 남은 삶도 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배순화/매듭장 : "평생을 실하고 매듭이 좋아서 50년을 넘게 잠 안 자고 밥 안 먹고 이렇게 했던 전적을 볼 때 이 매듭 끈 짜다가 죽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실과 한 몸이 되어 매듭을 엮어 온 장인의 손끝은 전통과 현대를 잇는 견고한 연결고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대담] 국민의힘 경남선대위 대선 전략은?](https://news.kbs.co.kr/data/news/title_image/newsmp4/changwon/news7/2022/01/11/140_5370029.jpg)
![[간추린 경남] 김해 제조공장 50대 끼임 사망사고 조사 외](https://news.kbs.co.kr/data/news/title_image/newsmp4/changwon/news7/2022/01/11/160_537006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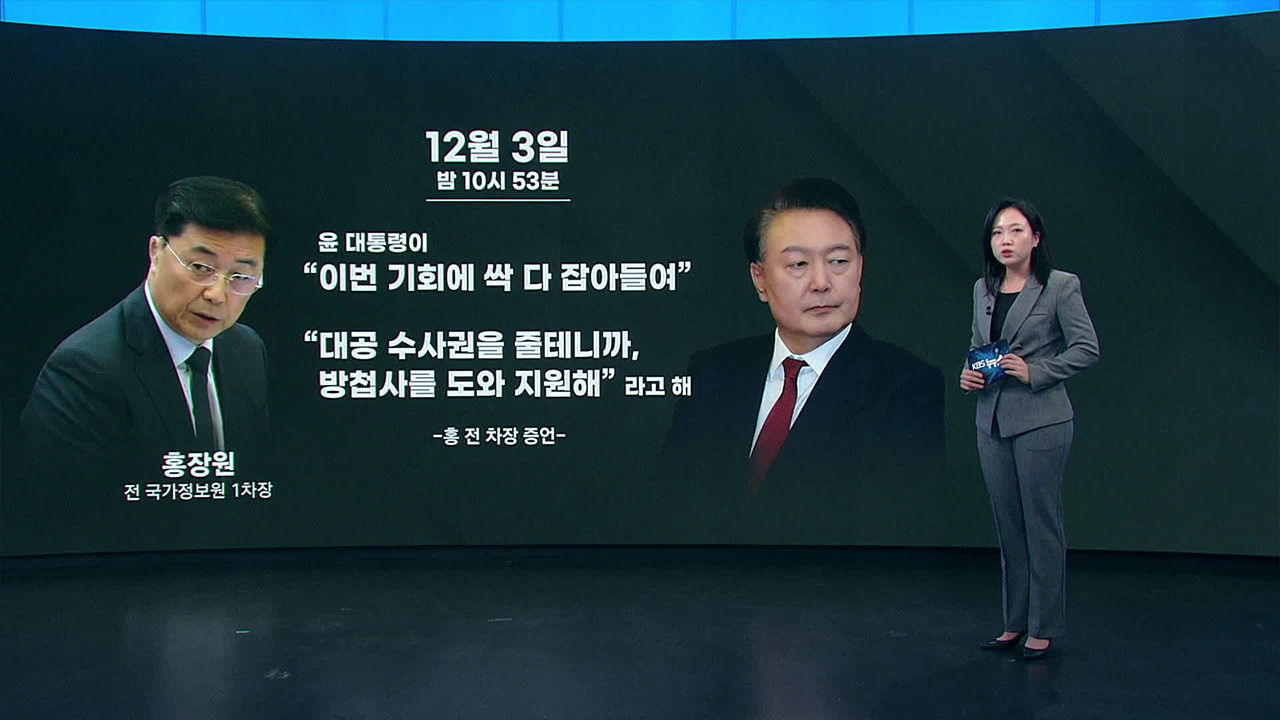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