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영향’ 지난해 사망자 약 32만 명…“역대 최대”
입력 2022.09.27 (13:07)
수정 2022.09.27 (13: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총사망자 수는 31만 명이 넘어 사망 원인 통계를 작성한 1983년 이래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오늘(27일) 발표한 '2021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지난해 총사망자 수는 31만 7,680명으로 1년 전보다 12,732명, 4.2% 늘었습니다.
남자 사망자 수는 17만 1,967명으로 전년 대비 6,804명, 4.1%가 늘었고, 여자 사망자 수는 14만 5,713명으로 전년 대비 5,928명, 4.2%가 증가했습니다.
1일 평균 사망자 수는 870명으로 1년 전보다 37명 늘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618.9명으로 1984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사망자 수와 사망률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은 인구 고령화가 가장 주 요인으로 보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도 사망 원인 12위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망자 수를 연령별로 보면, 80세 이상이 전체 사망자의 50%로, 1년 전보다 7% 증가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5.2%p 증가한 수치입니다.
통계청은 "80세 이상이 전체 사망자 수의 절반을 넘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며, 고령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3대 사망원인은 암과 심장질환, 폐렴이었습니다. 3대 사인은 전체 사인의 43.1%를 차지해 전년보다 1.7%p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인구 10만 명당 암 사망률은 161.1명으로 전년 대비 1.0명, 0.6% 증가했는데, 폐암, 간암, 대장암, 위암, 췌장암 순으로 높았습니다.
1년 전보다 백혈병, 전립선암, 자궁암 등의 사망률은 증가했는데, 위암, 간암, 뇌암 등의 사망률은 감소했습니다.
이 외에는 뇌혈관 질환, 고의적 자해(자살),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간 질환, 패혈증, 고혈압성 질환이 4위~10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패혈증은 2020년 처음 10대 사인에 포함됐는데, 지난해 한 단계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사망 원인 순위를 성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동일했지만, 여자의 경우 10대 사인에 처음으로 코로나 19가 포함되었고, 고의적 자해도 8위에서 7위로 순위가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5,0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4,080명이 늘어난 겁니다.
코로나19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9.8명으로 지난해보다 429.6%가 늘었습니다. 60세 이상에서 사망률이 급증하고 80세 이상 사망률이 124.0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코로나19 사망률은 서울이 19.3명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 11.5명, 충남 8.4명 순이었습니다.
통계청은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집계 기준의 차이로 질병 관리청과 수치가 다를 수 있다"며 "통계청 통계에는 외국에 거주하는 내국인도 포함돼 있지만, 질병청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대신 질병청 통계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살 사망자 수는 총 13,352명으로 1년 전보다 157명, 1.2% 증가했습니다. 특히, 3월(15.0%), 12월(14.1%), 6월(10.8%)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6명으로 1년 전보다 0.3명 증가했는데, 연령별로 보면, 10대, 20대, 70대 순으로 증가했고, 60대, 40대, 80세 이상 순으로 감소했습니다.
OECD 국가 간의 연령 구조 차이를 배제한 OECD 국가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OECD 평균 11.1명에 비해, 한국은 23.6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오늘(27일) 발표한 '2021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지난해 총사망자 수는 31만 7,680명으로 1년 전보다 12,732명, 4.2% 늘었습니다.
남자 사망자 수는 17만 1,967명으로 전년 대비 6,804명, 4.1%가 늘었고, 여자 사망자 수는 14만 5,713명으로 전년 대비 5,928명, 4.2%가 증가했습니다.
1일 평균 사망자 수는 870명으로 1년 전보다 37명 늘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618.9명으로 1984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사망자 수와 사망률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은 인구 고령화가 가장 주 요인으로 보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도 사망 원인 12위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망자 수를 연령별로 보면, 80세 이상이 전체 사망자의 50%로, 1년 전보다 7% 증가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5.2%p 증가한 수치입니다.
통계청은 "80세 이상이 전체 사망자 수의 절반을 넘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며, 고령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3대 사망원인은 암과 심장질환, 폐렴이었습니다. 3대 사인은 전체 사인의 43.1%를 차지해 전년보다 1.7%p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인구 10만 명당 암 사망률은 161.1명으로 전년 대비 1.0명, 0.6% 증가했는데, 폐암, 간암, 대장암, 위암, 췌장암 순으로 높았습니다.
1년 전보다 백혈병, 전립선암, 자궁암 등의 사망률은 증가했는데, 위암, 간암, 뇌암 등의 사망률은 감소했습니다.
이 외에는 뇌혈관 질환, 고의적 자해(자살),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간 질환, 패혈증, 고혈압성 질환이 4위~10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패혈증은 2020년 처음 10대 사인에 포함됐는데, 지난해 한 단계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사망 원인 순위를 성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동일했지만, 여자의 경우 10대 사인에 처음으로 코로나 19가 포함되었고, 고의적 자해도 8위에서 7위로 순위가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5,0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4,080명이 늘어난 겁니다.
코로나19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9.8명으로 지난해보다 429.6%가 늘었습니다. 60세 이상에서 사망률이 급증하고 80세 이상 사망률이 124.0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코로나19 사망률은 서울이 19.3명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 11.5명, 충남 8.4명 순이었습니다.
통계청은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집계 기준의 차이로 질병 관리청과 수치가 다를 수 있다"며 "통계청 통계에는 외국에 거주하는 내국인도 포함돼 있지만, 질병청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대신 질병청 통계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살 사망자 수는 총 13,352명으로 1년 전보다 157명, 1.2% 증가했습니다. 특히, 3월(15.0%), 12월(14.1%), 6월(10.8%)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6명으로 1년 전보다 0.3명 증가했는데, 연령별로 보면, 10대, 20대, 70대 순으로 증가했고, 60대, 40대, 80세 이상 순으로 감소했습니다.
OECD 국가 간의 연령 구조 차이를 배제한 OECD 국가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OECD 평균 11.1명에 비해, 한국은 23.6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령화 영향’ 지난해 사망자 약 32만 명…“역대 최대”
-
- 입력 2022-09-27 13:07:09
- 수정2022-09-27 13:12:03

인구 고령화가 심화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총사망자 수는 31만 명이 넘어 사망 원인 통계를 작성한 1983년 이래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오늘(27일) 발표한 '2021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지난해 총사망자 수는 31만 7,680명으로 1년 전보다 12,732명, 4.2% 늘었습니다.
남자 사망자 수는 17만 1,967명으로 전년 대비 6,804명, 4.1%가 늘었고, 여자 사망자 수는 14만 5,713명으로 전년 대비 5,928명, 4.2%가 증가했습니다.
1일 평균 사망자 수는 870명으로 1년 전보다 37명 늘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618.9명으로 1984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사망자 수와 사망률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은 인구 고령화가 가장 주 요인으로 보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도 사망 원인 12위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망자 수를 연령별로 보면, 80세 이상이 전체 사망자의 50%로, 1년 전보다 7% 증가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5.2%p 증가한 수치입니다.
통계청은 "80세 이상이 전체 사망자 수의 절반을 넘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며, 고령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3대 사망원인은 암과 심장질환, 폐렴이었습니다. 3대 사인은 전체 사인의 43.1%를 차지해 전년보다 1.7%p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인구 10만 명당 암 사망률은 161.1명으로 전년 대비 1.0명, 0.6% 증가했는데, 폐암, 간암, 대장암, 위암, 췌장암 순으로 높았습니다.
1년 전보다 백혈병, 전립선암, 자궁암 등의 사망률은 증가했는데, 위암, 간암, 뇌암 등의 사망률은 감소했습니다.
이 외에는 뇌혈관 질환, 고의적 자해(자살),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간 질환, 패혈증, 고혈압성 질환이 4위~10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패혈증은 2020년 처음 10대 사인에 포함됐는데, 지난해 한 단계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사망 원인 순위를 성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동일했지만, 여자의 경우 10대 사인에 처음으로 코로나 19가 포함되었고, 고의적 자해도 8위에서 7위로 순위가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5,0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4,080명이 늘어난 겁니다.
코로나19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9.8명으로 지난해보다 429.6%가 늘었습니다. 60세 이상에서 사망률이 급증하고 80세 이상 사망률이 124.0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코로나19 사망률은 서울이 19.3명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 11.5명, 충남 8.4명 순이었습니다.
통계청은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집계 기준의 차이로 질병 관리청과 수치가 다를 수 있다"며 "통계청 통계에는 외국에 거주하는 내국인도 포함돼 있지만, 질병청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대신 질병청 통계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살 사망자 수는 총 13,352명으로 1년 전보다 157명, 1.2% 증가했습니다. 특히, 3월(15.0%), 12월(14.1%), 6월(10.8%)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6명으로 1년 전보다 0.3명 증가했는데, 연령별로 보면, 10대, 20대, 70대 순으로 증가했고, 60대, 40대, 80세 이상 순으로 감소했습니다.
OECD 국가 간의 연령 구조 차이를 배제한 OECD 국가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OECD 평균 11.1명에 비해, 한국은 23.6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오늘(27일) 발표한 '2021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지난해 총사망자 수는 31만 7,680명으로 1년 전보다 12,732명, 4.2% 늘었습니다.
남자 사망자 수는 17만 1,967명으로 전년 대비 6,804명, 4.1%가 늘었고, 여자 사망자 수는 14만 5,713명으로 전년 대비 5,928명, 4.2%가 증가했습니다.
1일 평균 사망자 수는 870명으로 1년 전보다 37명 늘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618.9명으로 1984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사망자 수와 사망률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은 인구 고령화가 가장 주 요인으로 보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도 사망 원인 12위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망자 수를 연령별로 보면, 80세 이상이 전체 사망자의 50%로, 1년 전보다 7% 증가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5.2%p 증가한 수치입니다.
통계청은 "80세 이상이 전체 사망자 수의 절반을 넘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며, 고령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3대 사망원인은 암과 심장질환, 폐렴이었습니다. 3대 사인은 전체 사인의 43.1%를 차지해 전년보다 1.7%p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인구 10만 명당 암 사망률은 161.1명으로 전년 대비 1.0명, 0.6% 증가했는데, 폐암, 간암, 대장암, 위암, 췌장암 순으로 높았습니다.
1년 전보다 백혈병, 전립선암, 자궁암 등의 사망률은 증가했는데, 위암, 간암, 뇌암 등의 사망률은 감소했습니다.
이 외에는 뇌혈관 질환, 고의적 자해(자살),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간 질환, 패혈증, 고혈압성 질환이 4위~10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패혈증은 2020년 처음 10대 사인에 포함됐는데, 지난해 한 단계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사망 원인 순위를 성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동일했지만, 여자의 경우 10대 사인에 처음으로 코로나 19가 포함되었고, 고의적 자해도 8위에서 7위로 순위가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5,0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4,080명이 늘어난 겁니다.
코로나19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9.8명으로 지난해보다 429.6%가 늘었습니다. 60세 이상에서 사망률이 급증하고 80세 이상 사망률이 124.0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코로나19 사망률은 서울이 19.3명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 11.5명, 충남 8.4명 순이었습니다.
통계청은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집계 기준의 차이로 질병 관리청과 수치가 다를 수 있다"며 "통계청 통계에는 외국에 거주하는 내국인도 포함돼 있지만, 질병청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대신 질병청 통계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살 사망자 수는 총 13,352명으로 1년 전보다 157명, 1.2% 증가했습니다. 특히, 3월(15.0%), 12월(14.1%), 6월(10.8%)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6명으로 1년 전보다 0.3명 증가했는데, 연령별로 보면, 10대, 20대, 70대 순으로 증가했고, 60대, 40대, 80세 이상 순으로 감소했습니다.
OECD 국가 간의 연령 구조 차이를 배제한 OECD 국가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OECD 평균 11.1명에 비해, 한국은 23.6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박혜진 기자 root@kbs.co.kr
박혜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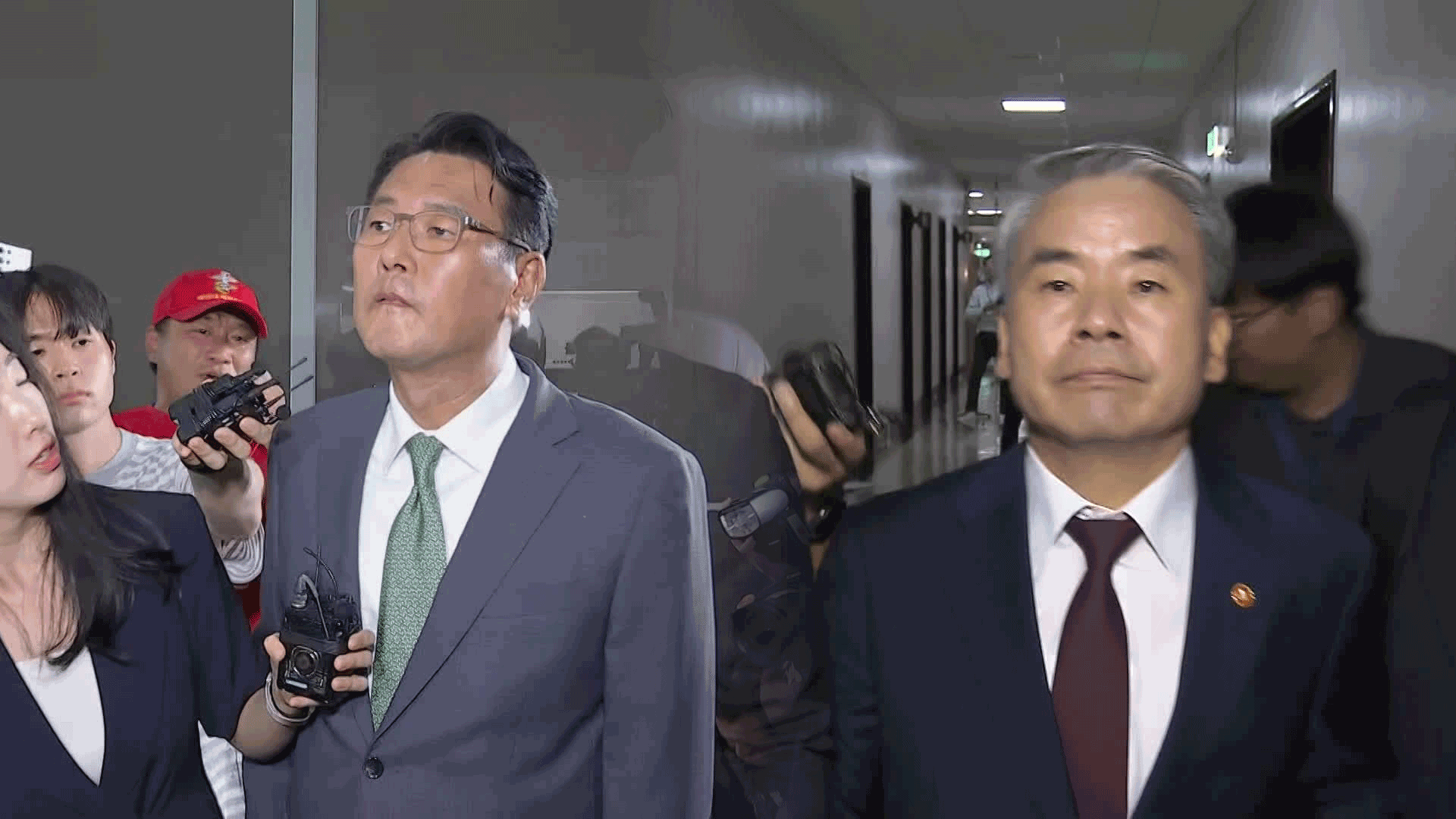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