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人] ‘성태뇌문’ 목공예의 정수…소목장 김금철
입력 2022.11.15 (20:04)
수정 2022.11.15 (20: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통제영 12공방에는 조선 목공예의 정수를 보여준 소목방이 있었습니다.
조형미와 실용성을 겸비한 통영장도 이곳에서 나왔는데요.
통영 소목의 맥을 잇는 소목장을 경남인에서 만나보시죠.
[리포트]
김금철 소목장이 공들여 만든 성태뇌문이층장입니다.
["가운데 부분이 오동이거든요. 이건 홍송입니다. 단단하고 병을 안 해서 못을 박아놔도 못이 안 빠집니다. 이게 우리 성태뇌문. 보기는 이래도 만들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선 빼기가, 선 만들기가 젤 힘들어요."]
일곱 가지 나무가 들어간 이층장에 멋을 더하는 성태뇌문은 특히 손이 많이 가는데요.
김금철 소목장은 전통문양을 재현하며 고집스럽게 통영 소목을 지켰습니다.
20여 종 넘는 목재가 빼곡한 건조실.
소목장에겐 쳐다만 봐도 배부른 보물창고입니다.
천 년 느티나무도 가구가 되려면 변형을 살피며 충분한 건조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김금철/소목장 : "이 느티나무가 1,300년 되었어요. 빨리 못 커가지고 이렇게 파도문양이 생기지요. 나무 문양을 골라가지고 문양을 새겨가면서 가구를 만듭니다."]
김금철 소목장은 열여덟 살 때 중요무형문화재 55호 고 천상원 소목장 아래서 소목 일을 배웠습니다.
스승과 그의 부친이 쓰던 연장도 기술과 함께 물려받았는데요. 120년 넘은 연장은 그에게 또 다른 스승이었습니다.
[김금철/소목장 : "(모서리는) 대패로 못 하니까 이렇게 해서 싹 깎습니다. 100년 더 됐습니다. 이건 우리 선생님 아버지가 쓰시던 거거든요. 먹통입니다. 옛날에는 나무를 자르려면 먹을 튕겨서 전기가 없다 보니까..."]
작업에 필요한 연장만 100여 가지.
나무를 고정하는 연장에 마루를 이어 붙인 대패 작업대, 톱날이 움직이는 톱까지 모두 직접 만든 연장인데요.
기계톱 대신 힘든 톱질을 고수하는 덴 이유가 있습니다.
["톱날이 이렇게 넓었는데 많이 써서 이렇게 닳았다 아닙니까. 기계로 켜면 톱밥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농을 12개를 할 것 같으면 한 발밖에 안 나와요."]
나무의 성질과 결, 문양을 살려 화장대 일부가 나오기까지 스무 단계 넘는 공정을 거쳤습니다.
물칠 한 아교를 발라 홈에 끼운 뒤엔 줄로 고정시키는데요. 못 없이도 100년 이상을 견디는 전통방식입니다.
["못을 안 주기 때문에 줄을 당겨야만 연귀가 딱 붙거든요. 이건 왜 고정대를 대냐면 옆에 모서리 깨진다고 깨지지 말라고 댑니다."]
재료부터 제작방식까지 원형을 이어온 통영 소목의 최대 강점은 실용성입니다.
위 아래가 분리되는 건 물론 '가락지’를 만들어 밀림을 방지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농이 밀려가지 않고 딱 그 자리에 있어요."]
나무의 기능을 살려 부위 별로 다른 나무를 배치한 것도 놀랍습니다.
["안쪽은 오동나무. 오동은 습기 차지 말라고, 옷에 냄새나지 말라고. 이게 배나무고 뒤에 붙는 게 오동이고요. 여기 감나무. 검은 감나무 흑심이고 흰 게 버드나무. 이건 느티나무고요. 발은 (단단한) 홍송이예요."]
나무를 조화롭게 연결하는 감각도 중요하지만 아자문(亞)으로도 불리는 성태 뇌문은 특히 까다로운 작업.
나무를 얇게 켜서 붙인 성곽 문양을 끼워 넣는 전통 목상감기법입니다.
["(성태뇌문) 이걸 선을 빼고 나면 사람이 몸살을 이틀을 한다고요."]
소목에 기하학적 아름다움을 더하는 장인의 수고로움 덕분에 성태뇌문은 통영 소목의 꽃으로 주목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 편리한 가구를 고민하다 통영사철버선장도 내놓는 등 잠시도 연장을 놓지 않았던 소목장에겐 바람이 있습니다.
[김금철/소목장 : "귀뇌문, 귀만 따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도 아주 많아요. 조금만 넉넉하면 귀뇌문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어서 후세한테 남겨줘야 하는데…. 이 일을 하다 보면 참 아름답고 진짜 좋은데 뒤따라주는 게 없다는 그런 게 있지요."]
잊혀진 전통문양을 되살려 통영 소목의 진가를 알리고 싶은 장인의 손은 여전히 빈손입니다.
하지만 비바람을 견디며 열매 맺는 나무처럼 그의 손은 강인한 나무를 닮았습니다.
통제영 12공방에는 조선 목공예의 정수를 보여준 소목방이 있었습니다.
조형미와 실용성을 겸비한 통영장도 이곳에서 나왔는데요.
통영 소목의 맥을 잇는 소목장을 경남인에서 만나보시죠.
[리포트]
김금철 소목장이 공들여 만든 성태뇌문이층장입니다.
["가운데 부분이 오동이거든요. 이건 홍송입니다. 단단하고 병을 안 해서 못을 박아놔도 못이 안 빠집니다. 이게 우리 성태뇌문. 보기는 이래도 만들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선 빼기가, 선 만들기가 젤 힘들어요."]
일곱 가지 나무가 들어간 이층장에 멋을 더하는 성태뇌문은 특히 손이 많이 가는데요.
김금철 소목장은 전통문양을 재현하며 고집스럽게 통영 소목을 지켰습니다.
20여 종 넘는 목재가 빼곡한 건조실.
소목장에겐 쳐다만 봐도 배부른 보물창고입니다.
천 년 느티나무도 가구가 되려면 변형을 살피며 충분한 건조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김금철/소목장 : "이 느티나무가 1,300년 되었어요. 빨리 못 커가지고 이렇게 파도문양이 생기지요. 나무 문양을 골라가지고 문양을 새겨가면서 가구를 만듭니다."]
김금철 소목장은 열여덟 살 때 중요무형문화재 55호 고 천상원 소목장 아래서 소목 일을 배웠습니다.
스승과 그의 부친이 쓰던 연장도 기술과 함께 물려받았는데요. 120년 넘은 연장은 그에게 또 다른 스승이었습니다.
[김금철/소목장 : "(모서리는) 대패로 못 하니까 이렇게 해서 싹 깎습니다. 100년 더 됐습니다. 이건 우리 선생님 아버지가 쓰시던 거거든요. 먹통입니다. 옛날에는 나무를 자르려면 먹을 튕겨서 전기가 없다 보니까..."]
작업에 필요한 연장만 100여 가지.
나무를 고정하는 연장에 마루를 이어 붙인 대패 작업대, 톱날이 움직이는 톱까지 모두 직접 만든 연장인데요.
기계톱 대신 힘든 톱질을 고수하는 덴 이유가 있습니다.
["톱날이 이렇게 넓었는데 많이 써서 이렇게 닳았다 아닙니까. 기계로 켜면 톱밥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농을 12개를 할 것 같으면 한 발밖에 안 나와요."]
나무의 성질과 결, 문양을 살려 화장대 일부가 나오기까지 스무 단계 넘는 공정을 거쳤습니다.
물칠 한 아교를 발라 홈에 끼운 뒤엔 줄로 고정시키는데요. 못 없이도 100년 이상을 견디는 전통방식입니다.
["못을 안 주기 때문에 줄을 당겨야만 연귀가 딱 붙거든요. 이건 왜 고정대를 대냐면 옆에 모서리 깨진다고 깨지지 말라고 댑니다."]
재료부터 제작방식까지 원형을 이어온 통영 소목의 최대 강점은 실용성입니다.
위 아래가 분리되는 건 물론 '가락지’를 만들어 밀림을 방지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농이 밀려가지 않고 딱 그 자리에 있어요."]
나무의 기능을 살려 부위 별로 다른 나무를 배치한 것도 놀랍습니다.
["안쪽은 오동나무. 오동은 습기 차지 말라고, 옷에 냄새나지 말라고. 이게 배나무고 뒤에 붙는 게 오동이고요. 여기 감나무. 검은 감나무 흑심이고 흰 게 버드나무. 이건 느티나무고요. 발은 (단단한) 홍송이예요."]
나무를 조화롭게 연결하는 감각도 중요하지만 아자문(亞)으로도 불리는 성태 뇌문은 특히 까다로운 작업.
나무를 얇게 켜서 붙인 성곽 문양을 끼워 넣는 전통 목상감기법입니다.
["(성태뇌문) 이걸 선을 빼고 나면 사람이 몸살을 이틀을 한다고요."]
소목에 기하학적 아름다움을 더하는 장인의 수고로움 덕분에 성태뇌문은 통영 소목의 꽃으로 주목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 편리한 가구를 고민하다 통영사철버선장도 내놓는 등 잠시도 연장을 놓지 않았던 소목장에겐 바람이 있습니다.
[김금철/소목장 : "귀뇌문, 귀만 따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도 아주 많아요. 조금만 넉넉하면 귀뇌문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어서 후세한테 남겨줘야 하는데…. 이 일을 하다 보면 참 아름답고 진짜 좋은데 뒤따라주는 게 없다는 그런 게 있지요."]
잊혀진 전통문양을 되살려 통영 소목의 진가를 알리고 싶은 장인의 손은 여전히 빈손입니다.
하지만 비바람을 견디며 열매 맺는 나무처럼 그의 손은 강인한 나무를 닮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남人] ‘성태뇌문’ 목공예의 정수…소목장 김금철
-
- 입력 2022-11-15 20:04:28
- 수정2022-11-15 20:18:05

[앵커]
통제영 12공방에는 조선 목공예의 정수를 보여준 소목방이 있었습니다.
조형미와 실용성을 겸비한 통영장도 이곳에서 나왔는데요.
통영 소목의 맥을 잇는 소목장을 경남인에서 만나보시죠.
[리포트]
김금철 소목장이 공들여 만든 성태뇌문이층장입니다.
["가운데 부분이 오동이거든요. 이건 홍송입니다. 단단하고 병을 안 해서 못을 박아놔도 못이 안 빠집니다. 이게 우리 성태뇌문. 보기는 이래도 만들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선 빼기가, 선 만들기가 젤 힘들어요."]
일곱 가지 나무가 들어간 이층장에 멋을 더하는 성태뇌문은 특히 손이 많이 가는데요.
김금철 소목장은 전통문양을 재현하며 고집스럽게 통영 소목을 지켰습니다.
20여 종 넘는 목재가 빼곡한 건조실.
소목장에겐 쳐다만 봐도 배부른 보물창고입니다.
천 년 느티나무도 가구가 되려면 변형을 살피며 충분한 건조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김금철/소목장 : "이 느티나무가 1,300년 되었어요. 빨리 못 커가지고 이렇게 파도문양이 생기지요. 나무 문양을 골라가지고 문양을 새겨가면서 가구를 만듭니다."]
김금철 소목장은 열여덟 살 때 중요무형문화재 55호 고 천상원 소목장 아래서 소목 일을 배웠습니다.
스승과 그의 부친이 쓰던 연장도 기술과 함께 물려받았는데요. 120년 넘은 연장은 그에게 또 다른 스승이었습니다.
[김금철/소목장 : "(모서리는) 대패로 못 하니까 이렇게 해서 싹 깎습니다. 100년 더 됐습니다. 이건 우리 선생님 아버지가 쓰시던 거거든요. 먹통입니다. 옛날에는 나무를 자르려면 먹을 튕겨서 전기가 없다 보니까..."]
작업에 필요한 연장만 100여 가지.
나무를 고정하는 연장에 마루를 이어 붙인 대패 작업대, 톱날이 움직이는 톱까지 모두 직접 만든 연장인데요.
기계톱 대신 힘든 톱질을 고수하는 덴 이유가 있습니다.
["톱날이 이렇게 넓었는데 많이 써서 이렇게 닳았다 아닙니까. 기계로 켜면 톱밥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농을 12개를 할 것 같으면 한 발밖에 안 나와요."]
나무의 성질과 결, 문양을 살려 화장대 일부가 나오기까지 스무 단계 넘는 공정을 거쳤습니다.
물칠 한 아교를 발라 홈에 끼운 뒤엔 줄로 고정시키는데요. 못 없이도 100년 이상을 견디는 전통방식입니다.
["못을 안 주기 때문에 줄을 당겨야만 연귀가 딱 붙거든요. 이건 왜 고정대를 대냐면 옆에 모서리 깨진다고 깨지지 말라고 댑니다."]
재료부터 제작방식까지 원형을 이어온 통영 소목의 최대 강점은 실용성입니다.
위 아래가 분리되는 건 물론 '가락지’를 만들어 밀림을 방지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농이 밀려가지 않고 딱 그 자리에 있어요."]
나무의 기능을 살려 부위 별로 다른 나무를 배치한 것도 놀랍습니다.
["안쪽은 오동나무. 오동은 습기 차지 말라고, 옷에 냄새나지 말라고. 이게 배나무고 뒤에 붙는 게 오동이고요. 여기 감나무. 검은 감나무 흑심이고 흰 게 버드나무. 이건 느티나무고요. 발은 (단단한) 홍송이예요."]
나무를 조화롭게 연결하는 감각도 중요하지만 아자문(亞)으로도 불리는 성태 뇌문은 특히 까다로운 작업.
나무를 얇게 켜서 붙인 성곽 문양을 끼워 넣는 전통 목상감기법입니다.
["(성태뇌문) 이걸 선을 빼고 나면 사람이 몸살을 이틀을 한다고요."]
소목에 기하학적 아름다움을 더하는 장인의 수고로움 덕분에 성태뇌문은 통영 소목의 꽃으로 주목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 편리한 가구를 고민하다 통영사철버선장도 내놓는 등 잠시도 연장을 놓지 않았던 소목장에겐 바람이 있습니다.
[김금철/소목장 : "귀뇌문, 귀만 따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도 아주 많아요. 조금만 넉넉하면 귀뇌문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어서 후세한테 남겨줘야 하는데…. 이 일을 하다 보면 참 아름답고 진짜 좋은데 뒤따라주는 게 없다는 그런 게 있지요."]
잊혀진 전통문양을 되살려 통영 소목의 진가를 알리고 싶은 장인의 손은 여전히 빈손입니다.
하지만 비바람을 견디며 열매 맺는 나무처럼 그의 손은 강인한 나무를 닮았습니다.
통제영 12공방에는 조선 목공예의 정수를 보여준 소목방이 있었습니다.
조형미와 실용성을 겸비한 통영장도 이곳에서 나왔는데요.
통영 소목의 맥을 잇는 소목장을 경남인에서 만나보시죠.
[리포트]
김금철 소목장이 공들여 만든 성태뇌문이층장입니다.
["가운데 부분이 오동이거든요. 이건 홍송입니다. 단단하고 병을 안 해서 못을 박아놔도 못이 안 빠집니다. 이게 우리 성태뇌문. 보기는 이래도 만들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선 빼기가, 선 만들기가 젤 힘들어요."]
일곱 가지 나무가 들어간 이층장에 멋을 더하는 성태뇌문은 특히 손이 많이 가는데요.
김금철 소목장은 전통문양을 재현하며 고집스럽게 통영 소목을 지켰습니다.
20여 종 넘는 목재가 빼곡한 건조실.
소목장에겐 쳐다만 봐도 배부른 보물창고입니다.
천 년 느티나무도 가구가 되려면 변형을 살피며 충분한 건조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김금철/소목장 : "이 느티나무가 1,300년 되었어요. 빨리 못 커가지고 이렇게 파도문양이 생기지요. 나무 문양을 골라가지고 문양을 새겨가면서 가구를 만듭니다."]
김금철 소목장은 열여덟 살 때 중요무형문화재 55호 고 천상원 소목장 아래서 소목 일을 배웠습니다.
스승과 그의 부친이 쓰던 연장도 기술과 함께 물려받았는데요. 120년 넘은 연장은 그에게 또 다른 스승이었습니다.
[김금철/소목장 : "(모서리는) 대패로 못 하니까 이렇게 해서 싹 깎습니다. 100년 더 됐습니다. 이건 우리 선생님 아버지가 쓰시던 거거든요. 먹통입니다. 옛날에는 나무를 자르려면 먹을 튕겨서 전기가 없다 보니까..."]
작업에 필요한 연장만 100여 가지.
나무를 고정하는 연장에 마루를 이어 붙인 대패 작업대, 톱날이 움직이는 톱까지 모두 직접 만든 연장인데요.
기계톱 대신 힘든 톱질을 고수하는 덴 이유가 있습니다.
["톱날이 이렇게 넓었는데 많이 써서 이렇게 닳았다 아닙니까. 기계로 켜면 톱밥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농을 12개를 할 것 같으면 한 발밖에 안 나와요."]
나무의 성질과 결, 문양을 살려 화장대 일부가 나오기까지 스무 단계 넘는 공정을 거쳤습니다.
물칠 한 아교를 발라 홈에 끼운 뒤엔 줄로 고정시키는데요. 못 없이도 100년 이상을 견디는 전통방식입니다.
["못을 안 주기 때문에 줄을 당겨야만 연귀가 딱 붙거든요. 이건 왜 고정대를 대냐면 옆에 모서리 깨진다고 깨지지 말라고 댑니다."]
재료부터 제작방식까지 원형을 이어온 통영 소목의 최대 강점은 실용성입니다.
위 아래가 분리되는 건 물론 '가락지’를 만들어 밀림을 방지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농이 밀려가지 않고 딱 그 자리에 있어요."]
나무의 기능을 살려 부위 별로 다른 나무를 배치한 것도 놀랍습니다.
["안쪽은 오동나무. 오동은 습기 차지 말라고, 옷에 냄새나지 말라고. 이게 배나무고 뒤에 붙는 게 오동이고요. 여기 감나무. 검은 감나무 흑심이고 흰 게 버드나무. 이건 느티나무고요. 발은 (단단한) 홍송이예요."]
나무를 조화롭게 연결하는 감각도 중요하지만 아자문(亞)으로도 불리는 성태 뇌문은 특히 까다로운 작업.
나무를 얇게 켜서 붙인 성곽 문양을 끼워 넣는 전통 목상감기법입니다.
["(성태뇌문) 이걸 선을 빼고 나면 사람이 몸살을 이틀을 한다고요."]
소목에 기하학적 아름다움을 더하는 장인의 수고로움 덕분에 성태뇌문은 통영 소목의 꽃으로 주목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 편리한 가구를 고민하다 통영사철버선장도 내놓는 등 잠시도 연장을 놓지 않았던 소목장에겐 바람이 있습니다.
[김금철/소목장 : "귀뇌문, 귀만 따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도 아주 많아요. 조금만 넉넉하면 귀뇌문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어서 후세한테 남겨줘야 하는데…. 이 일을 하다 보면 참 아름답고 진짜 좋은데 뒤따라주는 게 없다는 그런 게 있지요."]
잊혀진 전통문양을 되살려 통영 소목의 진가를 알리고 싶은 장인의 손은 여전히 빈손입니다.
하지만 비바람을 견디며 열매 맺는 나무처럼 그의 손은 강인한 나무를 닮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간추린 경남] 경남 ‘대학수능 고사장’ 116곳 방역 점검 외](https://news.kbs.co.kr/data/news/title_image/newsmp4/changwon/news7/2022/11/15/170_5602129.jpg)
![[날씨] 경남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날씨…건강관리 유의](https://news.kbs.co.kr/data/news/title_image/newsmp4/changwon/news7/2022/11/15/190_560213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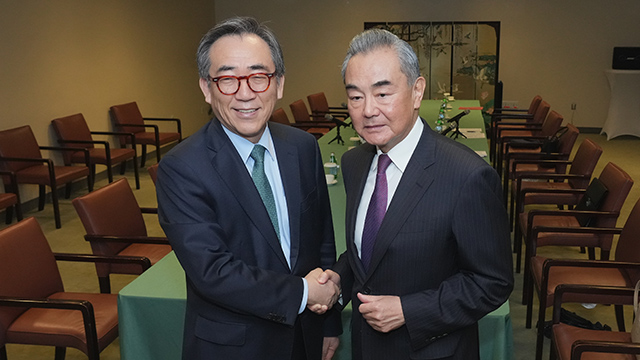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