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치안공백 우려’…경찰 “2,900명 행정관리직 현장 재배치”
입력 2023.09.18 (17:38)
수정 2023.09.18 (17: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 이후 ‘치안공백’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2,900여 명의 내근 행정관리인력을 치안 현장에 재배치합니다.
경찰청은 오늘(18일) “범죄예방과 대응 등 일선 현장의 치안역량을 높이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관리업무 위주의 부서들을 통폐합해 슬림한 조직으로 재편하고, 경찰 내부의 행정관리인력을 감축해 총 2,900여 명 가량을 치안현장으로 재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청 본청에선 생활안전국과 교통국을 생활안전교통국으로,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을 수사국으로, 형사국과 과학수사관리관을 형사국으로 통합하는 내용 등의 조직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시도지방청에서는 모두 28개 과를 감축하는 한편, 경찰관기동대 등 직할부대의 행정인력과 일선 경찰서에 비해 업무량이 적은 부서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300여 명의 인력이 감축됩니다.
경찰서의 경우는 소규모로 운영되던 부서 등을 통폐합, 과장·계장 등 중간관리 인력 위주로 1,500여 명을 감축해 현장 대응인력으로 전환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전국 경찰서 340여 개의 과·계가 통폐합돼 관리 인력이 감축되고, 경찰서 정보기능은 시도청에서 통합해 광역단위 정보활동 체제로 운영할 예정인데, 중복적으로 수행됐던 외사경찰 업무는 안보수사·정보 기능 등으로 이관된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경찰은 이같이 현장에 재배치되는 인력을 지구대, 파출소가 아닌 시도청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기동순찰대 28개대 2,600여 명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 지구대·파출소가 약 2,043개 7,213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축된 관리인력 2,900여 명을 전부 배치한다해도 팀당 0.4명 수준에 불과해 이 같은 방법으론 체감치안 제고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예상에 따른겁니다.
전 시도청에 설치되는 기동순찰대는 다중밀집장소, 공원·둘레길 등 범죄취약지에 집중 배치해 예방순찰 활동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외에 시도청과 경찰서 강력팀 일부인력을 전환해 16개대, 1,300여 명의 권역별 형사기동대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형사기동대는 예방적 형사활동 비중을 높여 운영될 예정으로, 유흥업소 주변 등 우범지역에 다수 인원을 집중 투입해 범죄분위기를 제압하겠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외에 치안 수요가 높은 일선 지구대·파출소에 인력과 장비를 집중하는 중심지역관서 등을 통한 순찰인력 3,200여 명, 경찰관기동대의 순찰 활용 등을 통해 모두 9,000여 명 이상의 실 순찰인력이 추가 확보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흩어져있던 각종 부서기능을 통합해 범죄예방 대응을 총괄하는 부서도 신설됩니다.
우선 본청에 ‘범죄예방 – 지역경찰 – 112상황’ 기능을 통합해 범죄예방과 대응을 총괄하는 범죄예방대응국을 신설하고,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에도 범죄예방대응과 혹은 범죄예방대응부를 신설합니다.
경찰은 “그동안 범죄예방 정책수립 부서와 범죄예방·대응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경찰·112상황대응 부서가 분리돼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며 통합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경찰조직을 범죄예방과 대응이라는 본질적 치안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의 대응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며 “경찰조직의 범죄예방·대응 기능이 강화되면서 국민 일상의 평온을 지켜가는 데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장 인력 보강으로 현재 진행중인 특별치안활동 수준의 범죄예방활동이 상시화되면서 체감 안전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오늘(18일) “범죄예방과 대응 등 일선 현장의 치안역량을 높이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관리업무 위주의 부서들을 통폐합해 슬림한 조직으로 재편하고, 경찰 내부의 행정관리인력을 감축해 총 2,900여 명 가량을 치안현장으로 재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청 본청에선 생활안전국과 교통국을 생활안전교통국으로,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을 수사국으로, 형사국과 과학수사관리관을 형사국으로 통합하는 내용 등의 조직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시도지방청에서는 모두 28개 과를 감축하는 한편, 경찰관기동대 등 직할부대의 행정인력과 일선 경찰서에 비해 업무량이 적은 부서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300여 명의 인력이 감축됩니다.
경찰서의 경우는 소규모로 운영되던 부서 등을 통폐합, 과장·계장 등 중간관리 인력 위주로 1,500여 명을 감축해 현장 대응인력으로 전환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전국 경찰서 340여 개의 과·계가 통폐합돼 관리 인력이 감축되고, 경찰서 정보기능은 시도청에서 통합해 광역단위 정보활동 체제로 운영할 예정인데, 중복적으로 수행됐던 외사경찰 업무는 안보수사·정보 기능 등으로 이관된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경찰은 이같이 현장에 재배치되는 인력을 지구대, 파출소가 아닌 시도청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기동순찰대 28개대 2,600여 명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 지구대·파출소가 약 2,043개 7,213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축된 관리인력 2,900여 명을 전부 배치한다해도 팀당 0.4명 수준에 불과해 이 같은 방법으론 체감치안 제고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예상에 따른겁니다.
전 시도청에 설치되는 기동순찰대는 다중밀집장소, 공원·둘레길 등 범죄취약지에 집중 배치해 예방순찰 활동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외에 시도청과 경찰서 강력팀 일부인력을 전환해 16개대, 1,300여 명의 권역별 형사기동대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형사기동대는 예방적 형사활동 비중을 높여 운영될 예정으로, 유흥업소 주변 등 우범지역에 다수 인원을 집중 투입해 범죄분위기를 제압하겠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외에 치안 수요가 높은 일선 지구대·파출소에 인력과 장비를 집중하는 중심지역관서 등을 통한 순찰인력 3,200여 명, 경찰관기동대의 순찰 활용 등을 통해 모두 9,000여 명 이상의 실 순찰인력이 추가 확보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흩어져있던 각종 부서기능을 통합해 범죄예방 대응을 총괄하는 부서도 신설됩니다.
우선 본청에 ‘범죄예방 – 지역경찰 – 112상황’ 기능을 통합해 범죄예방과 대응을 총괄하는 범죄예방대응국을 신설하고,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에도 범죄예방대응과 혹은 범죄예방대응부를 신설합니다.
경찰은 “그동안 범죄예방 정책수립 부서와 범죄예방·대응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경찰·112상황대응 부서가 분리돼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며 통합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경찰조직을 범죄예방과 대응이라는 본질적 치안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의 대응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며 “경찰조직의 범죄예방·대응 기능이 강화되면서 국민 일상의 평온을 지켜가는 데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장 인력 보강으로 현재 진행중인 특별치안활동 수준의 범죄예방활동이 상시화되면서 체감 안전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흉기난동 ‘치안공백 우려’…경찰 “2,900명 행정관리직 현장 재배치”
-
- 입력 2023-09-18 17:38:21
- 수정2023-09-18 17:46:00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 이후 ‘치안공백’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2,900여 명의 내근 행정관리인력을 치안 현장에 재배치합니다.
경찰청은 오늘(18일) “범죄예방과 대응 등 일선 현장의 치안역량을 높이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관리업무 위주의 부서들을 통폐합해 슬림한 조직으로 재편하고, 경찰 내부의 행정관리인력을 감축해 총 2,900여 명 가량을 치안현장으로 재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청 본청에선 생활안전국과 교통국을 생활안전교통국으로,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을 수사국으로, 형사국과 과학수사관리관을 형사국으로 통합하는 내용 등의 조직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시도지방청에서는 모두 28개 과를 감축하는 한편, 경찰관기동대 등 직할부대의 행정인력과 일선 경찰서에 비해 업무량이 적은 부서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300여 명의 인력이 감축됩니다.
경찰서의 경우는 소규모로 운영되던 부서 등을 통폐합, 과장·계장 등 중간관리 인력 위주로 1,500여 명을 감축해 현장 대응인력으로 전환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전국 경찰서 340여 개의 과·계가 통폐합돼 관리 인력이 감축되고, 경찰서 정보기능은 시도청에서 통합해 광역단위 정보활동 체제로 운영할 예정인데, 중복적으로 수행됐던 외사경찰 업무는 안보수사·정보 기능 등으로 이관된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경찰은 이같이 현장에 재배치되는 인력을 지구대, 파출소가 아닌 시도청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기동순찰대 28개대 2,600여 명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 지구대·파출소가 약 2,043개 7,213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축된 관리인력 2,900여 명을 전부 배치한다해도 팀당 0.4명 수준에 불과해 이 같은 방법으론 체감치안 제고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예상에 따른겁니다.
전 시도청에 설치되는 기동순찰대는 다중밀집장소, 공원·둘레길 등 범죄취약지에 집중 배치해 예방순찰 활동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외에 시도청과 경찰서 강력팀 일부인력을 전환해 16개대, 1,300여 명의 권역별 형사기동대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형사기동대는 예방적 형사활동 비중을 높여 운영될 예정으로, 유흥업소 주변 등 우범지역에 다수 인원을 집중 투입해 범죄분위기를 제압하겠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외에 치안 수요가 높은 일선 지구대·파출소에 인력과 장비를 집중하는 중심지역관서 등을 통한 순찰인력 3,200여 명, 경찰관기동대의 순찰 활용 등을 통해 모두 9,000여 명 이상의 실 순찰인력이 추가 확보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흩어져있던 각종 부서기능을 통합해 범죄예방 대응을 총괄하는 부서도 신설됩니다.
우선 본청에 ‘범죄예방 – 지역경찰 – 112상황’ 기능을 통합해 범죄예방과 대응을 총괄하는 범죄예방대응국을 신설하고,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에도 범죄예방대응과 혹은 범죄예방대응부를 신설합니다.
경찰은 “그동안 범죄예방 정책수립 부서와 범죄예방·대응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경찰·112상황대응 부서가 분리돼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며 통합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경찰조직을 범죄예방과 대응이라는 본질적 치안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의 대응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며 “경찰조직의 범죄예방·대응 기능이 강화되면서 국민 일상의 평온을 지켜가는 데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장 인력 보강으로 현재 진행중인 특별치안활동 수준의 범죄예방활동이 상시화되면서 체감 안전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오늘(18일) “범죄예방과 대응 등 일선 현장의 치안역량을 높이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관리업무 위주의 부서들을 통폐합해 슬림한 조직으로 재편하고, 경찰 내부의 행정관리인력을 감축해 총 2,900여 명 가량을 치안현장으로 재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청 본청에선 생활안전국과 교통국을 생활안전교통국으로,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을 수사국으로, 형사국과 과학수사관리관을 형사국으로 통합하는 내용 등의 조직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시도지방청에서는 모두 28개 과를 감축하는 한편, 경찰관기동대 등 직할부대의 행정인력과 일선 경찰서에 비해 업무량이 적은 부서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300여 명의 인력이 감축됩니다.
경찰서의 경우는 소규모로 운영되던 부서 등을 통폐합, 과장·계장 등 중간관리 인력 위주로 1,500여 명을 감축해 현장 대응인력으로 전환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전국 경찰서 340여 개의 과·계가 통폐합돼 관리 인력이 감축되고, 경찰서 정보기능은 시도청에서 통합해 광역단위 정보활동 체제로 운영할 예정인데, 중복적으로 수행됐던 외사경찰 업무는 안보수사·정보 기능 등으로 이관된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경찰은 이같이 현장에 재배치되는 인력을 지구대, 파출소가 아닌 시도청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기동순찰대 28개대 2,600여 명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 지구대·파출소가 약 2,043개 7,213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축된 관리인력 2,900여 명을 전부 배치한다해도 팀당 0.4명 수준에 불과해 이 같은 방법으론 체감치안 제고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예상에 따른겁니다.
전 시도청에 설치되는 기동순찰대는 다중밀집장소, 공원·둘레길 등 범죄취약지에 집중 배치해 예방순찰 활동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외에 시도청과 경찰서 강력팀 일부인력을 전환해 16개대, 1,300여 명의 권역별 형사기동대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형사기동대는 예방적 형사활동 비중을 높여 운영될 예정으로, 유흥업소 주변 등 우범지역에 다수 인원을 집중 투입해 범죄분위기를 제압하겠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외에 치안 수요가 높은 일선 지구대·파출소에 인력과 장비를 집중하는 중심지역관서 등을 통한 순찰인력 3,200여 명, 경찰관기동대의 순찰 활용 등을 통해 모두 9,000여 명 이상의 실 순찰인력이 추가 확보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흩어져있던 각종 부서기능을 통합해 범죄예방 대응을 총괄하는 부서도 신설됩니다.
우선 본청에 ‘범죄예방 – 지역경찰 – 112상황’ 기능을 통합해 범죄예방과 대응을 총괄하는 범죄예방대응국을 신설하고,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에도 범죄예방대응과 혹은 범죄예방대응부를 신설합니다.
경찰은 “그동안 범죄예방 정책수립 부서와 범죄예방·대응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경찰·112상황대응 부서가 분리돼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며 통합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경찰조직을 범죄예방과 대응이라는 본질적 치안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의 대응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며 “경찰조직의 범죄예방·대응 기능이 강화되면서 국민 일상의 평온을 지켜가는 데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장 인력 보강으로 현재 진행중인 특별치안활동 수준의 범죄예방활동이 상시화되면서 체감 안전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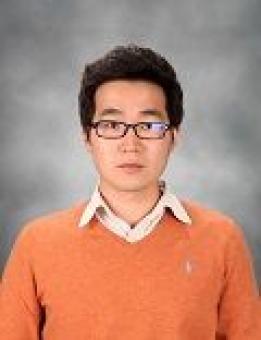
계현우 기자 kye@kbs.co.kr
계현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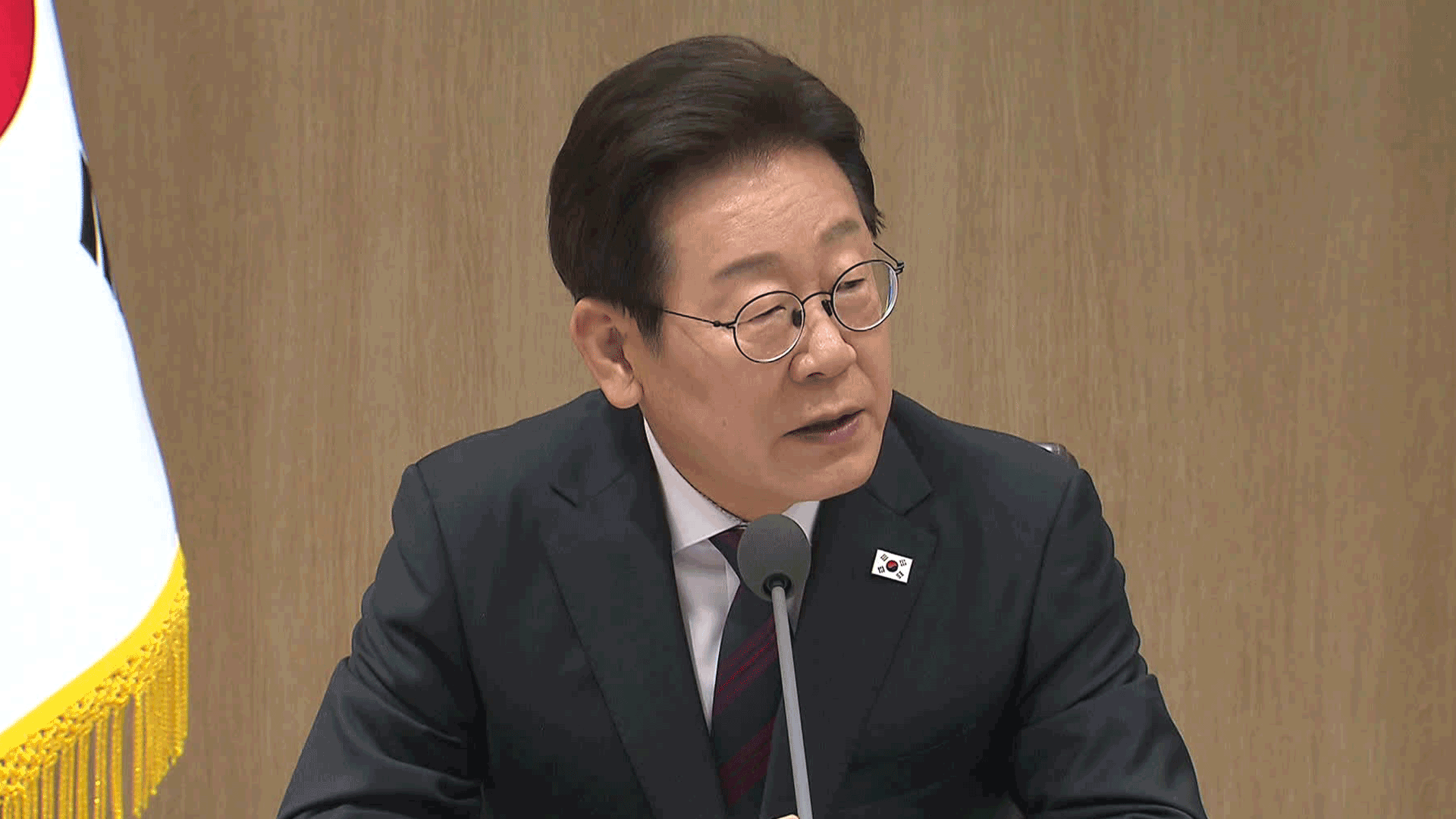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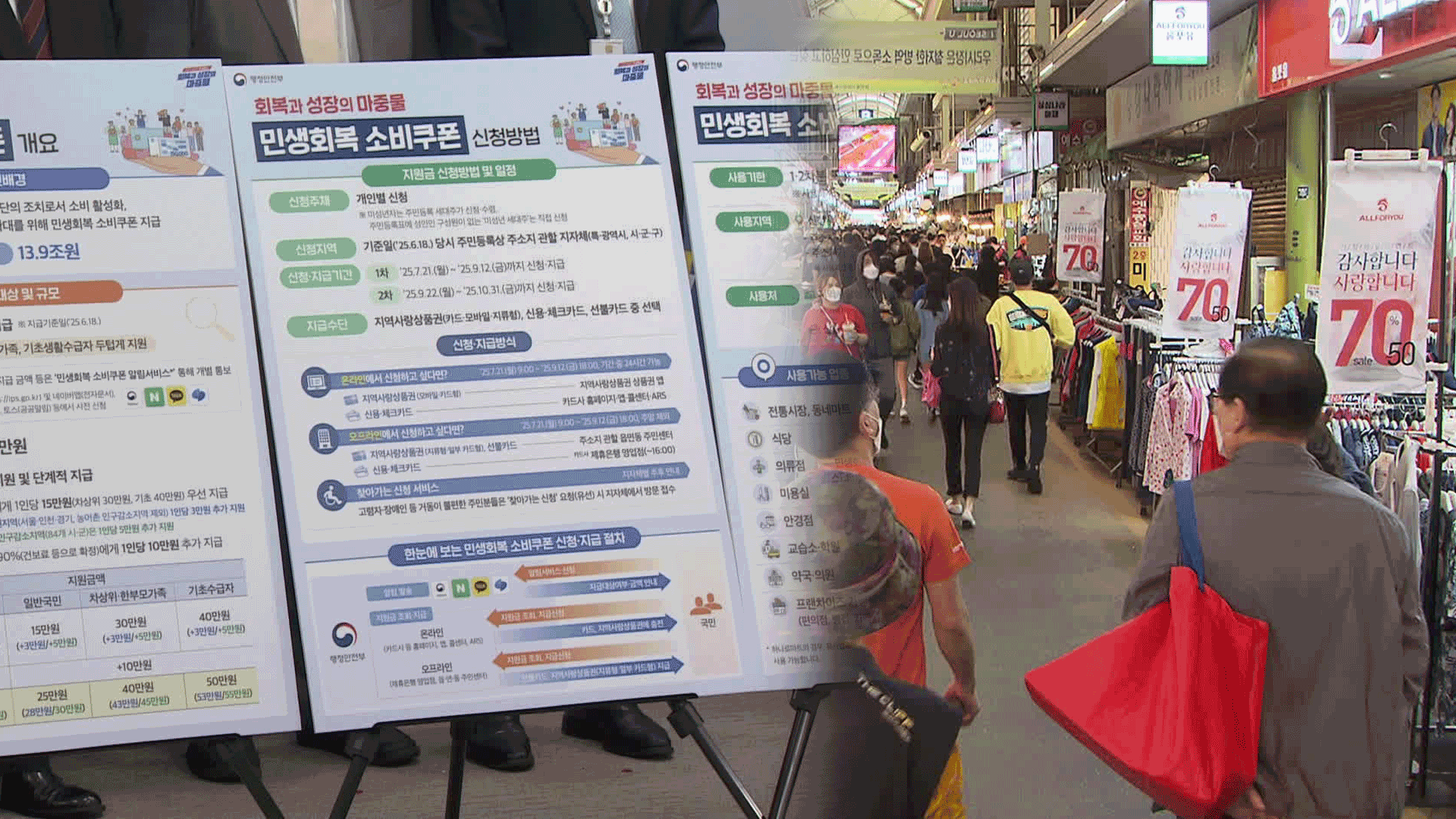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