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트] 북한 비무장지대 초소에 병력 투입…우리 대응은?
입력 2023.11.28 (18:25)
수정 2023.11.28 (18: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완전 파기를 선언한 뒤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복원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위협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군사적 긴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개형 해설위원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즉 GP를 복원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포착된 거죠?
[기자]
군 당국이 비무장지대 동부전선에서 감시장비로 촬영한 사진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촬영한 사진인데요, 9·19 남북군사합의로 북한군이 GP를 허물었는데, 바로 그곳에 감시소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세웠습니다.
야간에 경계근무를 서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무반동 기관총 등 중화기를 들고 이동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그동안 병력 활동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감시소를 다시 만들거나 화기를 옮긴 적은 없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앵커]
북한이 남북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게 23일이고, 다음날인 24일에 바로 GP에 감시소 등을 설치하는 모습이 포착된 셈인데, 합의 파기선언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긴 것이라고 봐야겠죠?
[기자]
북한은 이번 파기선언 전에도 GP를 복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적이 있습니다.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때 북한은 GP를 복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초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의 GP 상호 철수 조치에 따라 남북이 철수하기로 합의한 GP는 모두 11곳인데요,
군 당국은 북한군이 이들 11곳에서 기존 시설물을 복원하고, GP 주변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GP 전면 복원에 나선 만큼, 9·19 군사합의를 완전 파기했다고 봐야할 상황입니다.
[앵커]
군사합의 파기에다 군사적 행동을 감행하고 나선 것인데요,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우리 정부는 자위권 차원에서 북한의 위협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 : "9·19 합의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와 정찰 기능을 복원한 것이 북한의 ICBM 그리고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이듯이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행동은 또 전방에 감시 초소를 다시 만들고 무장을 한 것이니까 당장은 조금 지켜보겠지만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김 차장은 “상대방이 경계 초소에서 무장을 하고 위협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우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찰·수색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도 "신뢰를 깨고 있는 것은 북한"이라며, "우리 군도 대응하는 수준으로 간다"며 순차적인 대응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당장 우리 측 GP까지 복원하는 식의 맞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파괴된 우리 측 GP 복원을 위해서는 정부가 북한처럼 9·19 군사합의 완전 파기 수순을 밟거나 유엔사와의 정식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GP가 위치한 지역은 정전 협정에 따라 유엔사 관할이라서 병력이 복귀하려면 유엔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앵커]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효력 정지가 긴장을 불렀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정부의 입장은 일관됩니다.
우리 정부가 9·19 합의 효력 정지에 나선 이유는 북한의 합의 위반 때문이라는 겁니다.
북한이 3차례에 걸쳐 정찰위성을 쏘아 올린 것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9·19 합의 일부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킨 것인데, 북한이 오히려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에 북한이 줄곧 합의를 어기는 행위를 계속해오고 있다는 것도 이런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3600여 건 위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군사합의의 골자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인데, 이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해왔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침착하게 대응하되, 한반도에서 긴장이 조성되는 흐름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완전 파기를 선언한 뒤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복원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위협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군사적 긴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개형 해설위원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즉 GP를 복원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포착된 거죠?
[기자]
군 당국이 비무장지대 동부전선에서 감시장비로 촬영한 사진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촬영한 사진인데요, 9·19 남북군사합의로 북한군이 GP를 허물었는데, 바로 그곳에 감시소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세웠습니다.
야간에 경계근무를 서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무반동 기관총 등 중화기를 들고 이동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그동안 병력 활동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감시소를 다시 만들거나 화기를 옮긴 적은 없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앵커]
북한이 남북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게 23일이고, 다음날인 24일에 바로 GP에 감시소 등을 설치하는 모습이 포착된 셈인데, 합의 파기선언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긴 것이라고 봐야겠죠?
[기자]
북한은 이번 파기선언 전에도 GP를 복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적이 있습니다.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때 북한은 GP를 복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초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의 GP 상호 철수 조치에 따라 남북이 철수하기로 합의한 GP는 모두 11곳인데요,
군 당국은 북한군이 이들 11곳에서 기존 시설물을 복원하고, GP 주변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GP 전면 복원에 나선 만큼, 9·19 군사합의를 완전 파기했다고 봐야할 상황입니다.
[앵커]
군사합의 파기에다 군사적 행동을 감행하고 나선 것인데요,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우리 정부는 자위권 차원에서 북한의 위협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 : "9·19 합의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와 정찰 기능을 복원한 것이 북한의 ICBM 그리고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이듯이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행동은 또 전방에 감시 초소를 다시 만들고 무장을 한 것이니까 당장은 조금 지켜보겠지만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김 차장은 “상대방이 경계 초소에서 무장을 하고 위협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우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찰·수색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도 "신뢰를 깨고 있는 것은 북한"이라며, "우리 군도 대응하는 수준으로 간다"며 순차적인 대응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당장 우리 측 GP까지 복원하는 식의 맞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파괴된 우리 측 GP 복원을 위해서는 정부가 북한처럼 9·19 군사합의 완전 파기 수순을 밟거나 유엔사와의 정식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GP가 위치한 지역은 정전 협정에 따라 유엔사 관할이라서 병력이 복귀하려면 유엔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앵커]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효력 정지가 긴장을 불렀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정부의 입장은 일관됩니다.
우리 정부가 9·19 합의 효력 정지에 나선 이유는 북한의 합의 위반 때문이라는 겁니다.
북한이 3차례에 걸쳐 정찰위성을 쏘아 올린 것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9·19 합의 일부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킨 것인데, 북한이 오히려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에 북한이 줄곧 합의를 어기는 행위를 계속해오고 있다는 것도 이런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3600여 건 위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군사합의의 골자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인데, 이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해왔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침착하게 대응하되, 한반도에서 긴장이 조성되는 흐름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뉴스 인사이트] 북한 비무장지대 초소에 병력 투입…우리 대응은?
-
- 입력 2023-11-28 18:25:36
- 수정2023-11-28 18:36:32

[앵커]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완전 파기를 선언한 뒤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복원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위협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군사적 긴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개형 해설위원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즉 GP를 복원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포착된 거죠?
[기자]
군 당국이 비무장지대 동부전선에서 감시장비로 촬영한 사진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촬영한 사진인데요, 9·19 남북군사합의로 북한군이 GP를 허물었는데, 바로 그곳에 감시소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세웠습니다.
야간에 경계근무를 서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무반동 기관총 등 중화기를 들고 이동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그동안 병력 활동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감시소를 다시 만들거나 화기를 옮긴 적은 없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앵커]
북한이 남북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게 23일이고, 다음날인 24일에 바로 GP에 감시소 등을 설치하는 모습이 포착된 셈인데, 합의 파기선언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긴 것이라고 봐야겠죠?
[기자]
북한은 이번 파기선언 전에도 GP를 복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적이 있습니다.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때 북한은 GP를 복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초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의 GP 상호 철수 조치에 따라 남북이 철수하기로 합의한 GP는 모두 11곳인데요,
군 당국은 북한군이 이들 11곳에서 기존 시설물을 복원하고, GP 주변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GP 전면 복원에 나선 만큼, 9·19 군사합의를 완전 파기했다고 봐야할 상황입니다.
[앵커]
군사합의 파기에다 군사적 행동을 감행하고 나선 것인데요,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우리 정부는 자위권 차원에서 북한의 위협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 : "9·19 합의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와 정찰 기능을 복원한 것이 북한의 ICBM 그리고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이듯이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행동은 또 전방에 감시 초소를 다시 만들고 무장을 한 것이니까 당장은 조금 지켜보겠지만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김 차장은 “상대방이 경계 초소에서 무장을 하고 위협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우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찰·수색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도 "신뢰를 깨고 있는 것은 북한"이라며, "우리 군도 대응하는 수준으로 간다"며 순차적인 대응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당장 우리 측 GP까지 복원하는 식의 맞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파괴된 우리 측 GP 복원을 위해서는 정부가 북한처럼 9·19 군사합의 완전 파기 수순을 밟거나 유엔사와의 정식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GP가 위치한 지역은 정전 협정에 따라 유엔사 관할이라서 병력이 복귀하려면 유엔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앵커]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효력 정지가 긴장을 불렀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정부의 입장은 일관됩니다.
우리 정부가 9·19 합의 효력 정지에 나선 이유는 북한의 합의 위반 때문이라는 겁니다.
북한이 3차례에 걸쳐 정찰위성을 쏘아 올린 것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9·19 합의 일부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킨 것인데, 북한이 오히려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에 북한이 줄곧 합의를 어기는 행위를 계속해오고 있다는 것도 이런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3600여 건 위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군사합의의 골자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인데, 이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해왔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침착하게 대응하되, 한반도에서 긴장이 조성되는 흐름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완전 파기를 선언한 뒤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복원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위협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군사적 긴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개형 해설위원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즉 GP를 복원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포착된 거죠?
[기자]
군 당국이 비무장지대 동부전선에서 감시장비로 촬영한 사진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촬영한 사진인데요, 9·19 남북군사합의로 북한군이 GP를 허물었는데, 바로 그곳에 감시소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세웠습니다.
야간에 경계근무를 서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무반동 기관총 등 중화기를 들고 이동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그동안 병력 활동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감시소를 다시 만들거나 화기를 옮긴 적은 없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앵커]
북한이 남북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게 23일이고, 다음날인 24일에 바로 GP에 감시소 등을 설치하는 모습이 포착된 셈인데, 합의 파기선언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긴 것이라고 봐야겠죠?
[기자]
북한은 이번 파기선언 전에도 GP를 복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적이 있습니다.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때 북한은 GP를 복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초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의 GP 상호 철수 조치에 따라 남북이 철수하기로 합의한 GP는 모두 11곳인데요,
군 당국은 북한군이 이들 11곳에서 기존 시설물을 복원하고, GP 주변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GP 전면 복원에 나선 만큼, 9·19 군사합의를 완전 파기했다고 봐야할 상황입니다.
[앵커]
군사합의 파기에다 군사적 행동을 감행하고 나선 것인데요,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우리 정부는 자위권 차원에서 북한의 위협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 : "9·19 합의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와 정찰 기능을 복원한 것이 북한의 ICBM 그리고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이듯이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행동은 또 전방에 감시 초소를 다시 만들고 무장을 한 것이니까 당장은 조금 지켜보겠지만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김 차장은 “상대방이 경계 초소에서 무장을 하고 위협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우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찰·수색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도 "신뢰를 깨고 있는 것은 북한"이라며, "우리 군도 대응하는 수준으로 간다"며 순차적인 대응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당장 우리 측 GP까지 복원하는 식의 맞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파괴된 우리 측 GP 복원을 위해서는 정부가 북한처럼 9·19 군사합의 완전 파기 수순을 밟거나 유엔사와의 정식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GP가 위치한 지역은 정전 협정에 따라 유엔사 관할이라서 병력이 복귀하려면 유엔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앵커]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효력 정지가 긴장을 불렀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정부의 입장은 일관됩니다.
우리 정부가 9·19 합의 효력 정지에 나선 이유는 북한의 합의 위반 때문이라는 겁니다.
북한이 3차례에 걸쳐 정찰위성을 쏘아 올린 것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9·19 합의 일부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킨 것인데, 북한이 오히려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에 북한이 줄곧 합의를 어기는 행위를 계속해오고 있다는 것도 이런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3600여 건 위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군사합의의 골자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인데, 이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해왔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침착하게 대응하되, 한반도에서 긴장이 조성되는 흐름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

김개형 기자 thenews@kbs.co.kr
김개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단독] 위성락 실장 “전작권 협상 카드 아냐”…차관 인선 발표](/data/layer/904/2025/07/20250713_krfuHu.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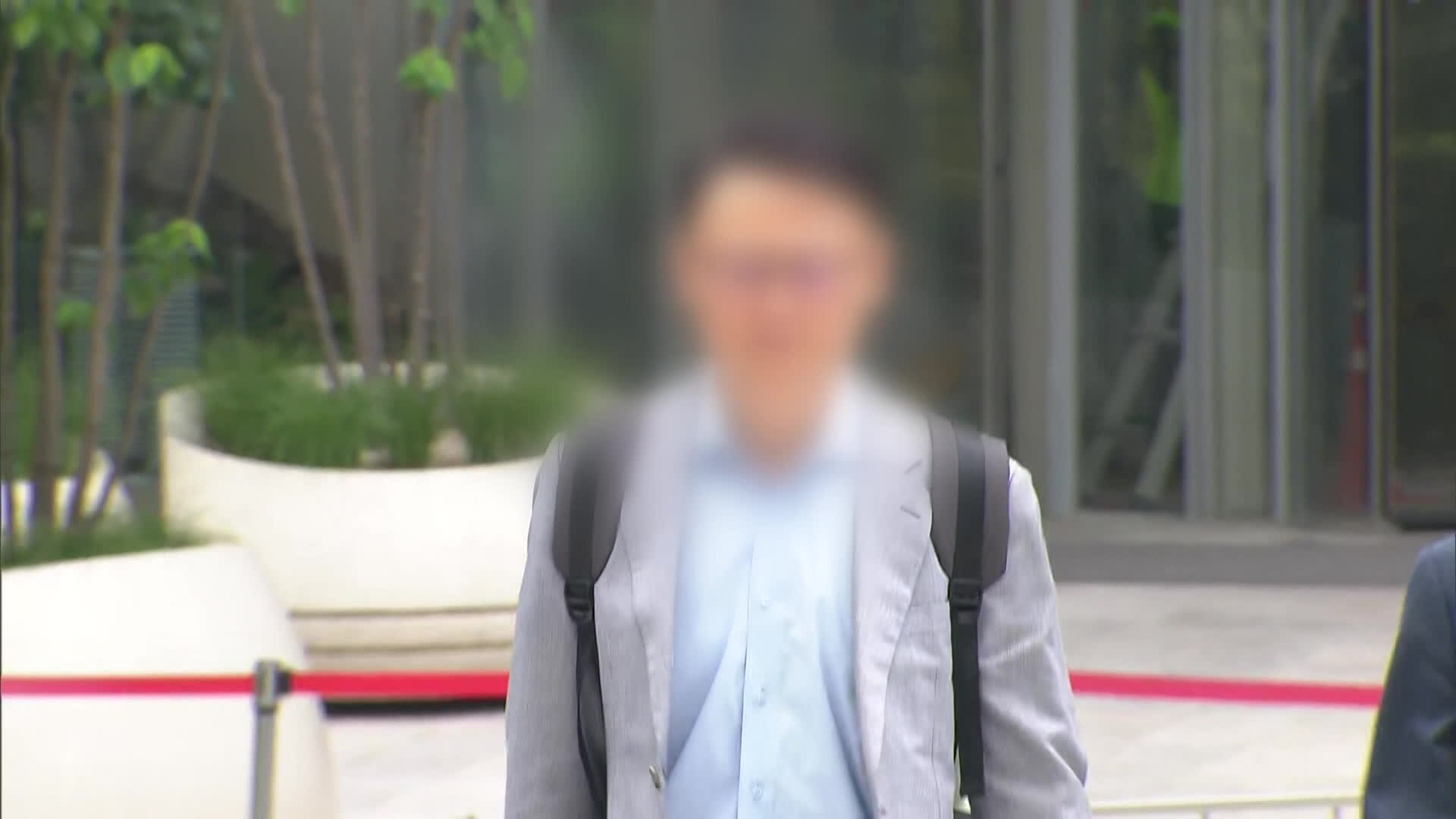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