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심 예산을 지역에 쓴다면…“30년 뒤 인구 300만 명 증가” [창+]
입력 2024.06.03 (07:02)
수정 2024.06.03 (07: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시사기획 창 '울산 탈출-청년을 잃어버린 도시' 중에서]
부산에서 태어나 대학까지 다닌 김란희 씨.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란희 씨는 올 초 개발자로 취직을 해 수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인터뷰> 김란희 / 옵스나우 AI 개발자
“교직 이수를 하고 선생님이 되려고 했지만 교생 실습을 나가면서 (적성과) 맞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전공을 살려보고 싶어서 개발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자고 했는데...”
사실 란희 씨는 부산시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역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부산시가 한 IT 기업과 함께 개설한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했고,
교육 중에 취업 기회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직장이 부산이 아닌 수도권에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인터뷰> 김란희/수도권 직장 근무
“저는 부산에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었는데 없다는 걸 빨리 깨달았고요. 교육을 듣는 과정에서 면접 기회가 주어진 거였는데 AI 서비스 개발자로 면접을 본 거였잖아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여기 취업하게 됐습니다.”
<인터뷰> 조영태 /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인구 미래 공존> 저자
“부동산 때문이에요. 혹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요. 젠더가 불평등해요. 또 일자리가 많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 맞습니다만 그 문제들을 만들어낸 기저에 뭐가 있냐. 수도권으로의 집중입니다. 청년 인구 집중.”
인구학자는 청년이 수도권으로 몰려서 대한민국에 지속가능성의 위기가 온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조영태 /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인구 미래 공존> 저자
“수도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특히 청년들이 몰려요. (청년들 입장에서) 나와 같은 청년이 주변에 많으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해야 해요. 일자리를 구하고 나면 아침에 (사람 가득한) 2호선이나 9호선을 타고 ‘내가 여기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나는 아직 준비가 안됐는데...' 그러면 준비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되면 출산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청년이 지역을 떠나 서울에 모이고, 대한민국엔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악순환입니다.
<인터뷰> 조영태 /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인구 미래 공존> 저자
“포항, 울산, 부산, 창원 전라도로 가면 여수, 순천, 광양까지도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국가의 문제이고요.”
경제학자들은 이 인구학적 악순환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를 봅니다.
KDI는 경제성장률이 오는 2050년 0.5%까지 떨어진다고 전망합니다.
저출생 고령화 때문입니다.
더 비관적 전망도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OECD 국가들이 먼저 걸어간 경로를 분석해보니 생산가능인구가 1% 줄어들면 GDP는 0.59%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적용해보면 2050년 인구가 35% 정도 줄기 때문에 GDP는 20% 줄어듭니다.
여기에 고령화까지 고려하면 GDP 감소폭은 더 커집니다.
<인터뷰> 유진성 /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인구 구조 변화 요인으로 인해서 2050년은 2022년 대비 GDP가 3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관후 / 건국대학교 상허교양대학 교수
“서울의 출생률이 낮아지고, 지방은 서울로의 집중이 심해지고, 서울은 경쟁이 점점 많아지고. 국가 전체적으로 출생률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은 별로 없고. 그렇게 되면 지금 악순환의 고리를 어디서 끊어야 하느냐.”
<인터뷰> 조영태 /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인구 미래 공존> 저자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 집중이 해소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청년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지역 거점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30년 뒤 인구가 지금 예상보다 50만 명 정도 늘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역 정책이 인구 방어 효과를 낸단 겁니다.
중앙대 연구팀의 수치는 더 극적입니다.
연구팀은 공간 구조를 바꾸는 인프라 투자의 효과에 주목했습니다.
<인터뷰> 마강래 /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대한민국이 위험해지고 있는 여러 요인 중에서 공간 쏠림 현상 수도권 쏠림 현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간을 어떻게 설계하고 디자인하는가가 너무 중요하지 않은가.”
가만히 있으면 2060년 인구는 4천만에 겨우 턱걸이하는데 정부가 연간 20조원의 재원을 30년간 균형발전을 위해 쓰면 인구가 300만 명 넘게 늡니다.
지역을 되살리면 대한민국의 인구를 지킬 수 있단 얘깁니다.
<인터뷰> 마강래 /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도로 나눠서 비수도권에 투자하면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을 막는 효과가 있고요. 청년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기업 활동도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고요. (반대로) 빽빽해진 수도권의 인구는 줄어들고 그래서 합계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는 여력을 갖는 거고요.”
관련 방송: 2024년 5월 21일(화) KBS 1TV, 22:00 <시사기획 창> 울산탈출 – 청년을 잃어버린 도시
'시사기획 창'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39&ref=pMenu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Eb31RoX5RnfYENmnyokN8A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angkbs
WAVVE '시사기획 창' 검색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수도권 중심 예산을 지역에 쓴다면…“30년 뒤 인구 300만 명 증가” [창+]
-
- 입력 2024-06-03 07:02:07
- 수정2024-06-03 07:04:29
[ 시사기획 창 '울산 탈출-청년을 잃어버린 도시' 중에서]
부산에서 태어나 대학까지 다닌 김란희 씨.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란희 씨는 올 초 개발자로 취직을 해 수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인터뷰> 김란희 / 옵스나우 AI 개발자
“교직 이수를 하고 선생님이 되려고 했지만 교생 실습을 나가면서 (적성과) 맞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전공을 살려보고 싶어서 개발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자고 했는데...”
사실 란희 씨는 부산시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역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부산시가 한 IT 기업과 함께 개설한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했고,
교육 중에 취업 기회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직장이 부산이 아닌 수도권에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인터뷰> 김란희/수도권 직장 근무
“저는 부산에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었는데 없다는 걸 빨리 깨달았고요. 교육을 듣는 과정에서 면접 기회가 주어진 거였는데 AI 서비스 개발자로 면접을 본 거였잖아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여기 취업하게 됐습니다.”
<인터뷰> 조영태 /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인구 미래 공존> 저자
“부동산 때문이에요. 혹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요. 젠더가 불평등해요. 또 일자리가 많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 맞습니다만 그 문제들을 만들어낸 기저에 뭐가 있냐. 수도권으로의 집중입니다. 청년 인구 집중.”
인구학자는 청년이 수도권으로 몰려서 대한민국에 지속가능성의 위기가 온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조영태 /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인구 미래 공존> 저자
“수도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특히 청년들이 몰려요. (청년들 입장에서) 나와 같은 청년이 주변에 많으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해야 해요. 일자리를 구하고 나면 아침에 (사람 가득한) 2호선이나 9호선을 타고 ‘내가 여기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나는 아직 준비가 안됐는데...' 그러면 준비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되면 출산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청년이 지역을 떠나 서울에 모이고, 대한민국엔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악순환입니다.
<인터뷰> 조영태 /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인구 미래 공존> 저자
“포항, 울산, 부산, 창원 전라도로 가면 여수, 순천, 광양까지도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국가의 문제이고요.”
경제학자들은 이 인구학적 악순환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를 봅니다.
KDI는 경제성장률이 오는 2050년 0.5%까지 떨어진다고 전망합니다.
저출생 고령화 때문입니다.
더 비관적 전망도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OECD 국가들이 먼저 걸어간 경로를 분석해보니 생산가능인구가 1% 줄어들면 GDP는 0.59%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적용해보면 2050년 인구가 35% 정도 줄기 때문에 GDP는 20% 줄어듭니다.
여기에 고령화까지 고려하면 GDP 감소폭은 더 커집니다.
<인터뷰> 유진성 /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인구 구조 변화 요인으로 인해서 2050년은 2022년 대비 GDP가 3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관후 / 건국대학교 상허교양대학 교수
“서울의 출생률이 낮아지고, 지방은 서울로의 집중이 심해지고, 서울은 경쟁이 점점 많아지고. 국가 전체적으로 출생률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은 별로 없고. 그렇게 되면 지금 악순환의 고리를 어디서 끊어야 하느냐.”
<인터뷰> 조영태 /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인구 미래 공존> 저자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 집중이 해소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청년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지역 거점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30년 뒤 인구가 지금 예상보다 50만 명 정도 늘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역 정책이 인구 방어 효과를 낸단 겁니다.
중앙대 연구팀의 수치는 더 극적입니다.
연구팀은 공간 구조를 바꾸는 인프라 투자의 효과에 주목했습니다.
<인터뷰> 마강래 /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대한민국이 위험해지고 있는 여러 요인 중에서 공간 쏠림 현상 수도권 쏠림 현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간을 어떻게 설계하고 디자인하는가가 너무 중요하지 않은가.”
가만히 있으면 2060년 인구는 4천만에 겨우 턱걸이하는데 정부가 연간 20조원의 재원을 30년간 균형발전을 위해 쓰면 인구가 300만 명 넘게 늡니다.
지역을 되살리면 대한민국의 인구를 지킬 수 있단 얘깁니다.
<인터뷰> 마강래 /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도로 나눠서 비수도권에 투자하면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을 막는 효과가 있고요. 청년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기업 활동도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고요. (반대로) 빽빽해진 수도권의 인구는 줄어들고 그래서 합계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는 여력을 갖는 거고요.”
관련 방송: 2024년 5월 21일(화) KBS 1TV, 22:00 <시사기획 창> 울산탈출 – 청년을 잃어버린 도시
'시사기획 창'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39&ref=pMenu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Eb31RoX5RnfYENmnyokN8A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angkbs
WAVVE '시사기획 창' 검색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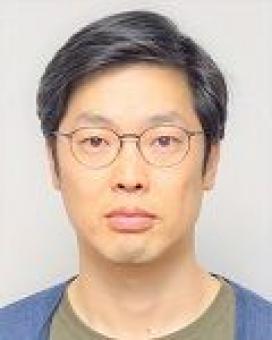
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서영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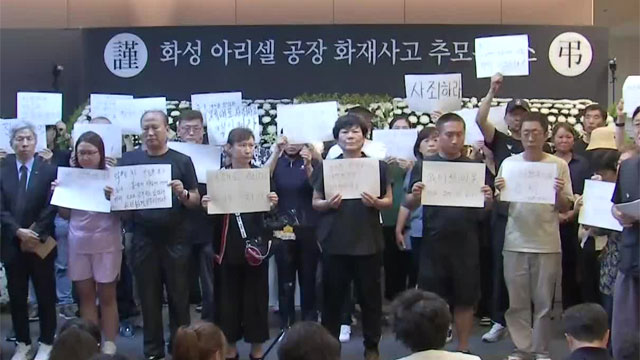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