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또 폭우 온다는데…산사태 위험 지역 ‘무방비’
입력 2024.07.14 (07:00)
수정 2024.07.14 (08: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산사태의 무서움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집. 지난해 7월 15일 발생한 산사태에 큰 피해를 본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에 있는 집입니다.
아무도 살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 들어갔던 집인데요. 잠시 뒤, 방 한 칸을 홀로 지키던 윤수아 할머니가 취재진을 맞았습니다.
지난 산사태에 집이 폐허가 됐다며, 뒷집의 냉장고 등 가전이 윤 할머니의 집으로 다 떠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폐허가 된 집 일부분을 가리키면서는 "원래 주방과 거실로 사용하던 곳"이라고 했고, 지금은 평상에 자그마한 가스레인지를 하나 두고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사태 1년 만에 찾은 벌방리. 아직 산사태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복구 중이고, 주민들은 임시 주택에 머물고 있습니다.
매년 폭우가 오면 발생하는 산사태. 지난해 벌방리에서는 마을 주민 15명이 숨졌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해 7월에만 26명(벌방리 포함)이 산사태 등 토사 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극한 호우에 어김없이 산사태가 발생해 충북 옥천, 충남 서천, 충남 금산 등에서 주민이 숨졌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산사태 인명 피해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KBS 취재진이 여러 산골 마을을 돌며 현장을 점검해 봤습니다.
■위험한 대피소…누가 지정했는지도 몰라
산사태 당시 벌방리는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산의 물길이 한 곳, 벌방리 마을로 향하고 있어 산사태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작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해 관리를 해야 했다는 겁니다.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KBS 취재진은 벌방리와 비슷한 곳이 있다고 해 한 번 찾아가 봤습니다.
 경북 예천군 보문면 오암2리.
경북 예천군 보문면 오암2리.바로 경북 예천군 보문면 오암2리인데요. 취재진과 동행한 정규원 산림기술사는 벌방리와 마을의 구조가 똑같다고 설명합니다.
정 산림기술사는 "지난해 예천, 영주에서 났던 산사태들의 표준 모델을 뽑아보면, 배산임수, 다 산으로 마을이 둘러싸여 있다"며 "아울러 지류가 발달돼 있고 위쪽에는 임도(산림도로) 등 인위적인 개발행위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비탈면에서 밭일을 하고 있던 오암2리 주민 안화분 할머니는 "비가 오면 위에 도랑에서 막 물이 내려와 길로 넘친다"며 "돌멩이가 막 굴러가기도 한다"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정규원 산림기술사가 오암2리 산사태 대피소의 문제점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정규원 산림기술사가 오암2리 산사태 대피소의 문제점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오암2리 입구에 있는 마을회관에는 '산사태 대피소'가 있기도 했는데요. 정 산림기술사는 대피소의 위치가 산사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산림기술사는 "마을 계곡의 복개천 바로 앞"이라며 "계곡의 직각 방향으로 서 있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산사태 대피소는 지자체에서 지정한다고 해 예천군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예천군 관계자는 "(대피소 표시)스티커는 떼야 한다"며 "산사태 대피소는 취약 지역으로 지정돼 있어야 지정할 수 있는데, 거기(오암2리)는 아직 지정이 안 됐다. 그래서 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산사태 대피소가 아닌데, 산사태 대피소 표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표시는 누가 붙여뒀을까요?
예천군 관계자는 "그거를 저도 잘 모르겠다"며 "예전부터 붙어 있었던 거 같은데, 올해 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규원 산림기술사는 대피소 선정에 있어 면밀한 검토는 물론, 마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대피소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군의원이 마을 바로 뒷산 나무 수천 그루 벌채
마을 바로 뒷산 나무 수천 그루가 벌채된다면, 어떨까요? 취재진이 찾은 충북 영동군 상촌면 흥덕리의 마을이 그랬습니다. 벌채된 곳 바로 아래에는 마을 10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취재진이 만난 주민들은 모두 불안하다며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김순이 할머니는 "산에 바위가 박혀 있는데, 비가 오면 집으로 바로 굴러 떨어질 거 같아 무섭다"며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흥덕리에서 만난 A 씨는 산사태 우려 민원도 들어간 거로 아는데 그대로 진행이 됐다며 역시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마을 뒷산을 벌채해간 건 누굴까. 확인해 보니 영동군에서 군의원을 여러 차례 한 지낸 B 씨였습니다.
B 전 군의원은 '산사태 위험이 있을 거 같다, 이런 건 다 계산을 하신 건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혹시 토사가 내려올 수도 있을 거 같아 밑에 하단부는 나무를 좀 남겨뒀다"며 "나름대로 대비는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산사태 염려는 뭐, 그럴 거 같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벌채를 허가해준 영동군청은 "산림기술사가 벌채 전에 다 조사를 했다"며 "장마철 특별히 더 유심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재 결과 B 씨가 4,000여 그루를 벌채해간 거로 확인됐는데, 벌채는 산사태와 연관이 없는 걸까요?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벌채는 분명 산사태에 큰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교수는 "보통 나무뿌리들이 (흙을) 억제하고, 물을 머금으면서 산사태를 억제한다"며 "벌목을 하게 되면 흙이 기본적으로 교란돼, (산으로 들어가는) 침수가 많이 늘게 된다. 산사태가 촉진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산지도 개인 소유가 있어, 무작정 개발을 불허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벌채나 산지를 개발할 때, 인허가 조건으로 산사태 피해에 대한 각서 등을 받으면 좋을 거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충북 영동군에서는, 실제 벌채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산사태 취약지역 바로 옆에 벌채 허가가 나기도 했습니다.
■산사태 철저히 대비해야
 지난해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에서 발생한 산사태 당시 모습. 녹색연합 제공
지난해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에서 발생한 산사태 당시 모습. 녹색연합 제공90년대부터 산사태 현장을 다니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은 시민단체 녹색연합.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대피를 잘하는 것이 인명 피해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합니다.
서 전문위원은 전화나 문자보다는 "재난 지킴이 같은 인력을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고용해, 마을 이장과 함께 집집이 찾아가 주민들을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가 많이 올 때, 산의 상태를 면밀하게 감시해 미리 대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수곤 전 교수는 현재 위험 지역 실태 파악이 정확하게 안 돼 있다며 관련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래 산사태 자체를 막기는 쉽지 않다며 "(위험이 있는 곳에) 2m 정도 높이의 철근 콘크리트 벽 같은 거를 설치해 산사태가 났을 때 토석류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14일) 밤 10시 10분, KBS 1TV <[더 보다]폭우가 온다>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다음주 또 폭우 온다는데…산사태 위험 지역 ‘무방비’
-
- 입력 2024-07-14 07:00:12
- 수정2024-07-14 08:07:52
산사태의 무서움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집. 지난해 7월 15일 발생한 산사태에 큰 피해를 본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에 있는 집입니다.
아무도 살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 들어갔던 집인데요. 잠시 뒤, 방 한 칸을 홀로 지키던 윤수아 할머니가 취재진을 맞았습니다.
지난 산사태에 집이 폐허가 됐다며, 뒷집의 냉장고 등 가전이 윤 할머니의 집으로 다 떠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폐허가 된 집 일부분을 가리키면서는 "원래 주방과 거실로 사용하던 곳"이라고 했고, 지금은 평상에 자그마한 가스레인지를 하나 두고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사태 1년 만에 찾은 벌방리. 아직 산사태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복구 중이고, 주민들은 임시 주택에 머물고 있습니다.
매년 폭우가 오면 발생하는 산사태. 지난해 벌방리에서는 마을 주민 15명이 숨졌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해 7월에만 26명(벌방리 포함)이 산사태 등 토사 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극한 호우에 어김없이 산사태가 발생해 충북 옥천, 충남 서천, 충남 금산 등에서 주민이 숨졌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산사태 인명 피해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KBS 취재진이 여러 산골 마을을 돌며 현장을 점검해 봤습니다.
■위험한 대피소…누가 지정했는지도 몰라
산사태 당시 벌방리는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산의 물길이 한 곳, 벌방리 마을로 향하고 있어 산사태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작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해 관리를 해야 했다는 겁니다.

KBS 취재진은 벌방리와 비슷한 곳이 있다고 해 한 번 찾아가 봤습니다.

바로 경북 예천군 보문면 오암2리인데요. 취재진과 동행한 정규원 산림기술사는 벌방리와 마을의 구조가 똑같다고 설명합니다.
정 산림기술사는 "지난해 예천, 영주에서 났던 산사태들의 표준 모델을 뽑아보면, 배산임수, 다 산으로 마을이 둘러싸여 있다"며 "아울러 지류가 발달돼 있고 위쪽에는 임도(산림도로) 등 인위적인 개발행위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비탈면에서 밭일을 하고 있던 오암2리 주민 안화분 할머니는 "비가 오면 위에 도랑에서 막 물이 내려와 길로 넘친다"며 "돌멩이가 막 굴러가기도 한다"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오암2리 입구에 있는 마을회관에는 '산사태 대피소'가 있기도 했는데요. 정 산림기술사는 대피소의 위치가 산사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산림기술사는 "마을 계곡의 복개천 바로 앞"이라며 "계곡의 직각 방향으로 서 있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산사태 대피소는 지자체에서 지정한다고 해 예천군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예천군 관계자는 "(대피소 표시)스티커는 떼야 한다"며 "산사태 대피소는 취약 지역으로 지정돼 있어야 지정할 수 있는데, 거기(오암2리)는 아직 지정이 안 됐다. 그래서 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산사태 대피소가 아닌데, 산사태 대피소 표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표시는 누가 붙여뒀을까요?
예천군 관계자는 "그거를 저도 잘 모르겠다"며 "예전부터 붙어 있었던 거 같은데, 올해 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규원 산림기술사는 대피소 선정에 있어 면밀한 검토는 물론, 마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대피소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군의원이 마을 바로 뒷산 나무 수천 그루 벌채
마을 바로 뒷산 나무 수천 그루가 벌채된다면, 어떨까요? 취재진이 찾은 충북 영동군 상촌면 흥덕리의 마을이 그랬습니다. 벌채된 곳 바로 아래에는 마을 10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취재진이 만난 주민들은 모두 불안하다며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김순이 할머니는 "산에 바위가 박혀 있는데, 비가 오면 집으로 바로 굴러 떨어질 거 같아 무섭다"며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흥덕리에서 만난 A 씨는 산사태 우려 민원도 들어간 거로 아는데 그대로 진행이 됐다며 역시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마을 뒷산을 벌채해간 건 누굴까. 확인해 보니 영동군에서 군의원을 여러 차례 한 지낸 B 씨였습니다.
B 전 군의원은 '산사태 위험이 있을 거 같다, 이런 건 다 계산을 하신 건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혹시 토사가 내려올 수도 있을 거 같아 밑에 하단부는 나무를 좀 남겨뒀다"며 "나름대로 대비는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산사태 염려는 뭐, 그럴 거 같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벌채를 허가해준 영동군청은 "산림기술사가 벌채 전에 다 조사를 했다"며 "장마철 특별히 더 유심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재 결과 B 씨가 4,000여 그루를 벌채해간 거로 확인됐는데, 벌채는 산사태와 연관이 없는 걸까요?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벌채는 분명 산사태에 큰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교수는 "보통 나무뿌리들이 (흙을) 억제하고, 물을 머금으면서 산사태를 억제한다"며 "벌목을 하게 되면 흙이 기본적으로 교란돼, (산으로 들어가는) 침수가 많이 늘게 된다. 산사태가 촉진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산지도 개인 소유가 있어, 무작정 개발을 불허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벌채나 산지를 개발할 때, 인허가 조건으로 산사태 피해에 대한 각서 등을 받으면 좋을 거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충북 영동군에서는, 실제 벌채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산사태 취약지역 바로 옆에 벌채 허가가 나기도 했습니다.
■산사태 철저히 대비해야

90년대부터 산사태 현장을 다니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은 시민단체 녹색연합.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대피를 잘하는 것이 인명 피해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합니다.
서 전문위원은 전화나 문자보다는 "재난 지킴이 같은 인력을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고용해, 마을 이장과 함께 집집이 찾아가 주민들을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가 많이 올 때, 산의 상태를 면밀하게 감시해 미리 대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수곤 전 교수는 현재 위험 지역 실태 파악이 정확하게 안 돼 있다며 관련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래 산사태 자체를 막기는 쉽지 않다며 "(위험이 있는 곳에) 2m 정도 높이의 철근 콘크리트 벽 같은 거를 설치해 산사태가 났을 때 토석류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14일) 밤 10시 10분, KBS 1TV <[더 보다]폭우가 온다>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
-

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방준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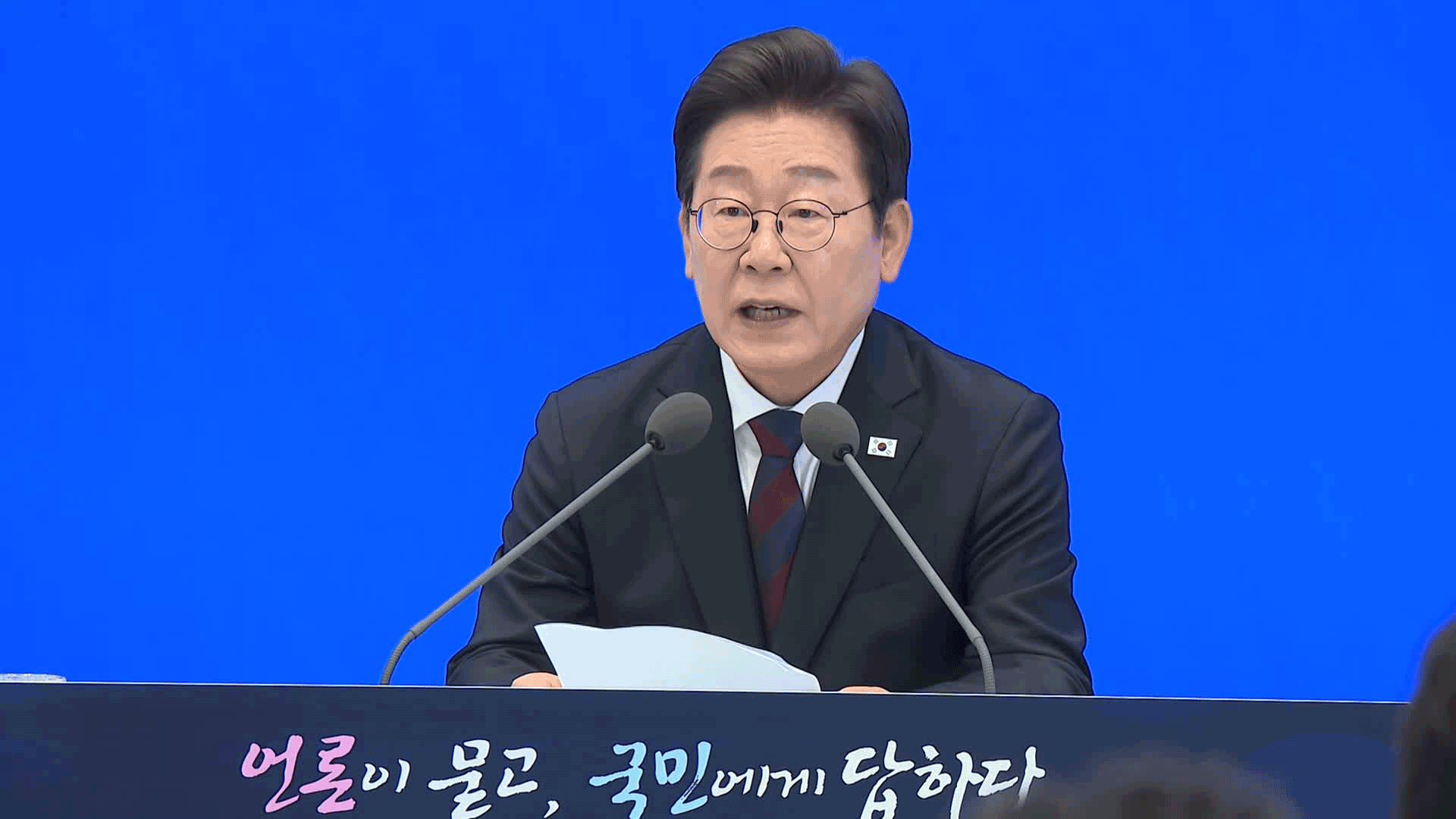
![[단독] 도이치 주포 “김건희, 내 덕에 떼돈 벌어…22억 원 주문”](/data/news/2025/07/03/20250703_KpuU43.png)
![[단독] “쪽지 얼핏 봤다, 안 받았다”더니…CCTV에선 문건 챙긴 이상민](/data/news/2025/07/03/20250703_Lv3LjI.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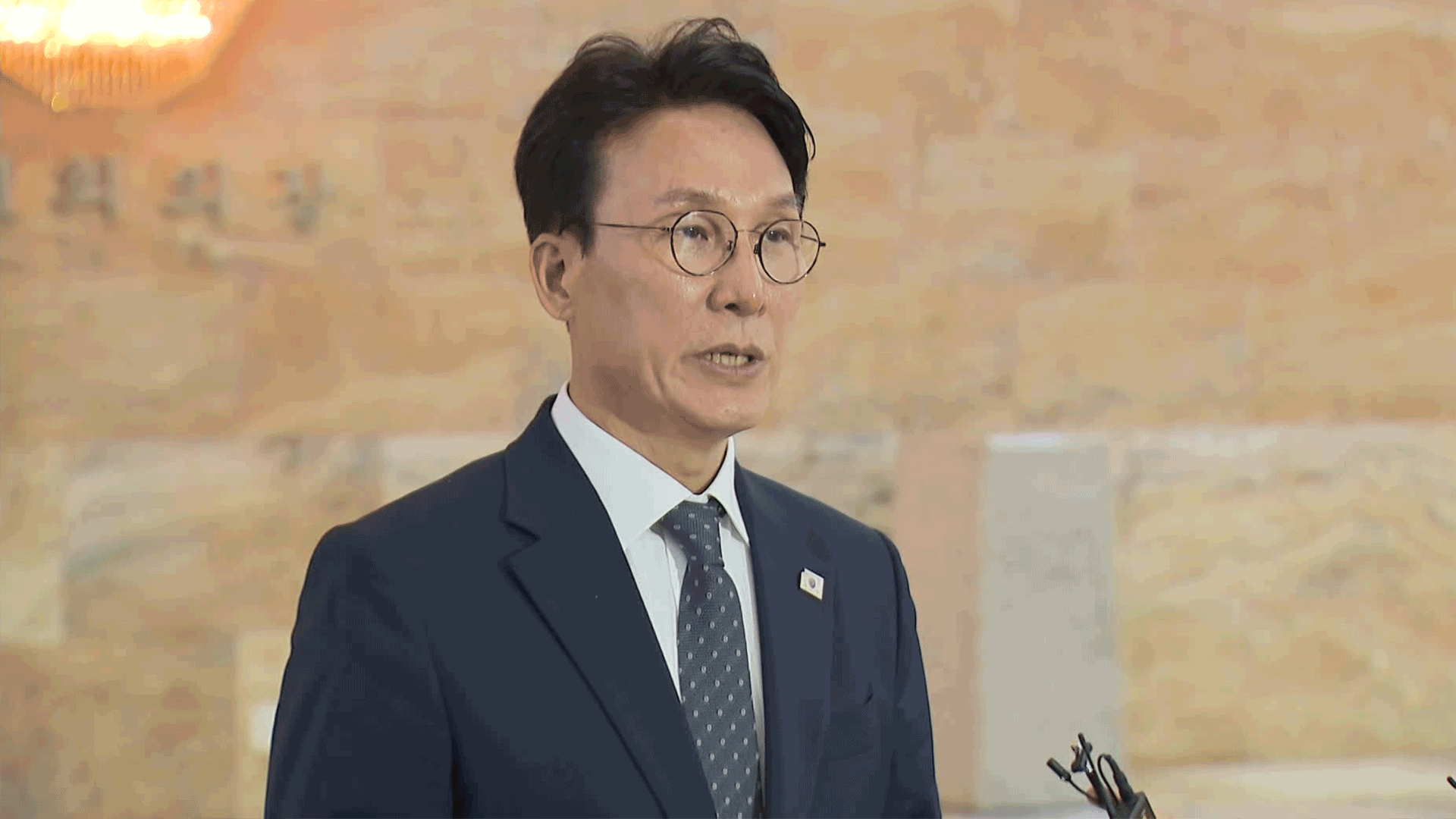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