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숨진 노동자 1,600여 명…중대재해 처벌 2%대
입력 2025.02.19 (19:33)
수정 2025.02.19 (20: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공사 현장 등 일터 곳곳에서 계속되는 안전사고 실태와 대책을 살펴보는 연속 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일하다 숨진 노동자가 전국적으로 무려 천 6백여 명이나 되는데요,
안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실제 처벌로 이어진 건 고작 2%대에 그쳤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충북의 첫 근로자 사망 사고는 2022년 2월, 보은의 한 제조업체에서 났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 것! 들 것!"]
당시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도중 제어기 오작동으로 기계 설비에 끼어 숨졌습니다.
사고 발생 2년 6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에서, 원청업체 대표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조사 대상 사고는 전국적으로 1,600여 건.
노동자 1,600여 명이 숨졌지만, 재판까지 넘겨진 건 70여 건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법원 판결이 나온 사건은 31건에 그칩니다.
최근 3년 동안 중대재해 사고의 2% 정도만 처벌이 이뤄진 겁니다.
법의 취지는 경영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과실이 있다면 강력히 처벌해 중대재해를 막자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엄벌로 이어진 사례는 드뭅니다.
1심 판결이 이뤄진 31건 가운데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 1년 또는 2년의 실형이 선고된 건 4건입니다.
징역형의 집행 유예로 풀려난 사례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벌금형 또는 무죄가 각각 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의 사례를 두고 노사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법의 취지가 퇴색됐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경영자 측에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원청 업체에 불리한 법 적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법조계에서는 모호한 법 조항과 해석 등으로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권영국/변호사 : "현재 법령을 어떻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엄한 처벌 사례를 남기느냐에 따라서 이 법의 실효성이 살아난다고 보거든요."]
한편, 산업재해가 아닌 중대 시민재해 사건으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 등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영상편집:조의성/그래픽:오은지
공사 현장 등 일터 곳곳에서 계속되는 안전사고 실태와 대책을 살펴보는 연속 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일하다 숨진 노동자가 전국적으로 무려 천 6백여 명이나 되는데요,
안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실제 처벌로 이어진 건 고작 2%대에 그쳤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충북의 첫 근로자 사망 사고는 2022년 2월, 보은의 한 제조업체에서 났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 것! 들 것!"]
당시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도중 제어기 오작동으로 기계 설비에 끼어 숨졌습니다.
사고 발생 2년 6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에서, 원청업체 대표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조사 대상 사고는 전국적으로 1,600여 건.
노동자 1,600여 명이 숨졌지만, 재판까지 넘겨진 건 70여 건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법원 판결이 나온 사건은 31건에 그칩니다.
최근 3년 동안 중대재해 사고의 2% 정도만 처벌이 이뤄진 겁니다.
법의 취지는 경영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과실이 있다면 강력히 처벌해 중대재해를 막자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엄벌로 이어진 사례는 드뭅니다.
1심 판결이 이뤄진 31건 가운데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 1년 또는 2년의 실형이 선고된 건 4건입니다.
징역형의 집행 유예로 풀려난 사례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벌금형 또는 무죄가 각각 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의 사례를 두고 노사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법의 취지가 퇴색됐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경영자 측에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원청 업체에 불리한 법 적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법조계에서는 모호한 법 조항과 해석 등으로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권영국/변호사 : "현재 법령을 어떻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엄한 처벌 사례를 남기느냐에 따라서 이 법의 실효성이 살아난다고 보거든요."]
한편, 산업재해가 아닌 중대 시민재해 사건으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 등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영상편집:조의성/그래픽:오은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일하다 숨진 노동자 1,600여 명…중대재해 처벌 2%대
-
- 입력 2025-02-19 19:33:37
- 수정2025-02-19 20:12:06

[앵커]
공사 현장 등 일터 곳곳에서 계속되는 안전사고 실태와 대책을 살펴보는 연속 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일하다 숨진 노동자가 전국적으로 무려 천 6백여 명이나 되는데요,
안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실제 처벌로 이어진 건 고작 2%대에 그쳤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충북의 첫 근로자 사망 사고는 2022년 2월, 보은의 한 제조업체에서 났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 것! 들 것!"]
당시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도중 제어기 오작동으로 기계 설비에 끼어 숨졌습니다.
사고 발생 2년 6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에서, 원청업체 대표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조사 대상 사고는 전국적으로 1,600여 건.
노동자 1,600여 명이 숨졌지만, 재판까지 넘겨진 건 70여 건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법원 판결이 나온 사건은 31건에 그칩니다.
최근 3년 동안 중대재해 사고의 2% 정도만 처벌이 이뤄진 겁니다.
법의 취지는 경영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과실이 있다면 강력히 처벌해 중대재해를 막자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엄벌로 이어진 사례는 드뭅니다.
1심 판결이 이뤄진 31건 가운데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 1년 또는 2년의 실형이 선고된 건 4건입니다.
징역형의 집행 유예로 풀려난 사례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벌금형 또는 무죄가 각각 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의 사례를 두고 노사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법의 취지가 퇴색됐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경영자 측에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원청 업체에 불리한 법 적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법조계에서는 모호한 법 조항과 해석 등으로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권영국/변호사 : "현재 법령을 어떻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엄한 처벌 사례를 남기느냐에 따라서 이 법의 실효성이 살아난다고 보거든요."]
한편, 산업재해가 아닌 중대 시민재해 사건으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 등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영상편집:조의성/그래픽:오은지
공사 현장 등 일터 곳곳에서 계속되는 안전사고 실태와 대책을 살펴보는 연속 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일하다 숨진 노동자가 전국적으로 무려 천 6백여 명이나 되는데요,
안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실제 처벌로 이어진 건 고작 2%대에 그쳤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충북의 첫 근로자 사망 사고는 2022년 2월, 보은의 한 제조업체에서 났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 것! 들 것!"]
당시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도중 제어기 오작동으로 기계 설비에 끼어 숨졌습니다.
사고 발생 2년 6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에서, 원청업체 대표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조사 대상 사고는 전국적으로 1,600여 건.
노동자 1,600여 명이 숨졌지만, 재판까지 넘겨진 건 70여 건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법원 판결이 나온 사건은 31건에 그칩니다.
최근 3년 동안 중대재해 사고의 2% 정도만 처벌이 이뤄진 겁니다.
법의 취지는 경영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과실이 있다면 강력히 처벌해 중대재해를 막자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엄벌로 이어진 사례는 드뭅니다.
1심 판결이 이뤄진 31건 가운데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 1년 또는 2년의 실형이 선고된 건 4건입니다.
징역형의 집행 유예로 풀려난 사례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벌금형 또는 무죄가 각각 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의 사례를 두고 노사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법의 취지가 퇴색됐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경영자 측에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원청 업체에 불리한 법 적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법조계에서는 모호한 법 조항과 해석 등으로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권영국/변호사 : "현재 법령을 어떻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엄한 처벌 사례를 남기느냐에 따라서 이 법의 실효성이 살아난다고 보거든요."]
한편, 산업재해가 아닌 중대 시민재해 사건으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 등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영상편집:조의성/그래픽:오은지
-
-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송근섭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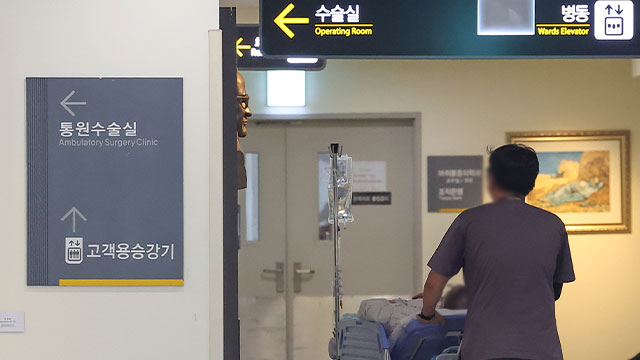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