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땅꺼짐·이태원 참사, 중대재해 책임 못 물어…제도 손봐야”
입력 2025.04.09 (14:22)
수정 2025.04.09 (14: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발생한 대형 땅꺼짐(싱크홀)으로 1명이 숨지는 싱크홀 사건과 159명이 숨진 10·29 이태원 참사 등 도로에서 일어난 사망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도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제도가 여전히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 등의 설계·설치·관리상 결함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소방청 등 중앙부처에서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을 지정 관리합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159명이 사망한 10·29 이태원 참사와 최근 강동구 싱크홀 사고 모두 도로에서 시민이 사망했지만,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도로가 해당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시민 안전이 중대재해처벌법만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에는 시설물안전법상 제1∼3종시설물이 포함되고, 안전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인정되는 교량과 터널 등입니다.
이 시설물들은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돼 관리되고 있으며 올해 3월 기준 총 17만 8,897개로 파악된다고 경실련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중 시설물안전법상 제1∼3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은 총 2만 5,449개입니다.
결국 FMS 등록 시설물 중 중대시민재해 대상으로 관리되는 것은 14.2%에 불과하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입니다.
경실련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로 중대시민재해 관리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중심이라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경실련은 “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서는 실질적인 안전 확보보다는 과도한 문서생산과 외부 컨설팅 의존, 보여주기식 안전 행사 등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모습이 나타난다”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법의 내용과 구조가 전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도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제도가 여전히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 등의 설계·설치·관리상 결함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소방청 등 중앙부처에서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을 지정 관리합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159명이 사망한 10·29 이태원 참사와 최근 강동구 싱크홀 사고 모두 도로에서 시민이 사망했지만,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도로가 해당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시민 안전이 중대재해처벌법만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에는 시설물안전법상 제1∼3종시설물이 포함되고, 안전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인정되는 교량과 터널 등입니다.
이 시설물들은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돼 관리되고 있으며 올해 3월 기준 총 17만 8,897개로 파악된다고 경실련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중 시설물안전법상 제1∼3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은 총 2만 5,449개입니다.
결국 FMS 등록 시설물 중 중대시민재해 대상으로 관리되는 것은 14.2%에 불과하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입니다.
경실련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로 중대시민재해 관리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중심이라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경실련은 “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서는 실질적인 안전 확보보다는 과도한 문서생산과 외부 컨설팅 의존, 보여주기식 안전 행사 등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모습이 나타난다”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법의 내용과 구조가 전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실련 “땅꺼짐·이태원 참사, 중대재해 책임 못 물어…제도 손봐야”
-
- 입력 2025-04-09 14:22:53
- 수정2025-04-09 14:26:54

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발생한 대형 땅꺼짐(싱크홀)으로 1명이 숨지는 싱크홀 사건과 159명이 숨진 10·29 이태원 참사 등 도로에서 일어난 사망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도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제도가 여전히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 등의 설계·설치·관리상 결함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소방청 등 중앙부처에서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을 지정 관리합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159명이 사망한 10·29 이태원 참사와 최근 강동구 싱크홀 사고 모두 도로에서 시민이 사망했지만,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도로가 해당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시민 안전이 중대재해처벌법만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에는 시설물안전법상 제1∼3종시설물이 포함되고, 안전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인정되는 교량과 터널 등입니다.
이 시설물들은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돼 관리되고 있으며 올해 3월 기준 총 17만 8,897개로 파악된다고 경실련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중 시설물안전법상 제1∼3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은 총 2만 5,449개입니다.
결국 FMS 등록 시설물 중 중대시민재해 대상으로 관리되는 것은 14.2%에 불과하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입니다.
경실련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로 중대시민재해 관리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중심이라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경실련은 “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서는 실질적인 안전 확보보다는 과도한 문서생산과 외부 컨설팅 의존, 보여주기식 안전 행사 등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모습이 나타난다”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법의 내용과 구조가 전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도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제도가 여전히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 등의 설계·설치·관리상 결함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소방청 등 중앙부처에서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을 지정 관리합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159명이 사망한 10·29 이태원 참사와 최근 강동구 싱크홀 사고 모두 도로에서 시민이 사망했지만,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도로가 해당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시민 안전이 중대재해처벌법만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에는 시설물안전법상 제1∼3종시설물이 포함되고, 안전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인정되는 교량과 터널 등입니다.
이 시설물들은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돼 관리되고 있으며 올해 3월 기준 총 17만 8,897개로 파악된다고 경실련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중 시설물안전법상 제1∼3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은 총 2만 5,449개입니다.
결국 FMS 등록 시설물 중 중대시민재해 대상으로 관리되는 것은 14.2%에 불과하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입니다.
경실련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로 중대시민재해 관리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중심이라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경실련은 “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서는 실질적인 안전 확보보다는 과도한 문서생산과 외부 컨설팅 의존, 보여주기식 안전 행사 등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모습이 나타난다”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법의 내용과 구조가 전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
-

최민영 기자 mymy@kbs.co.kr
최민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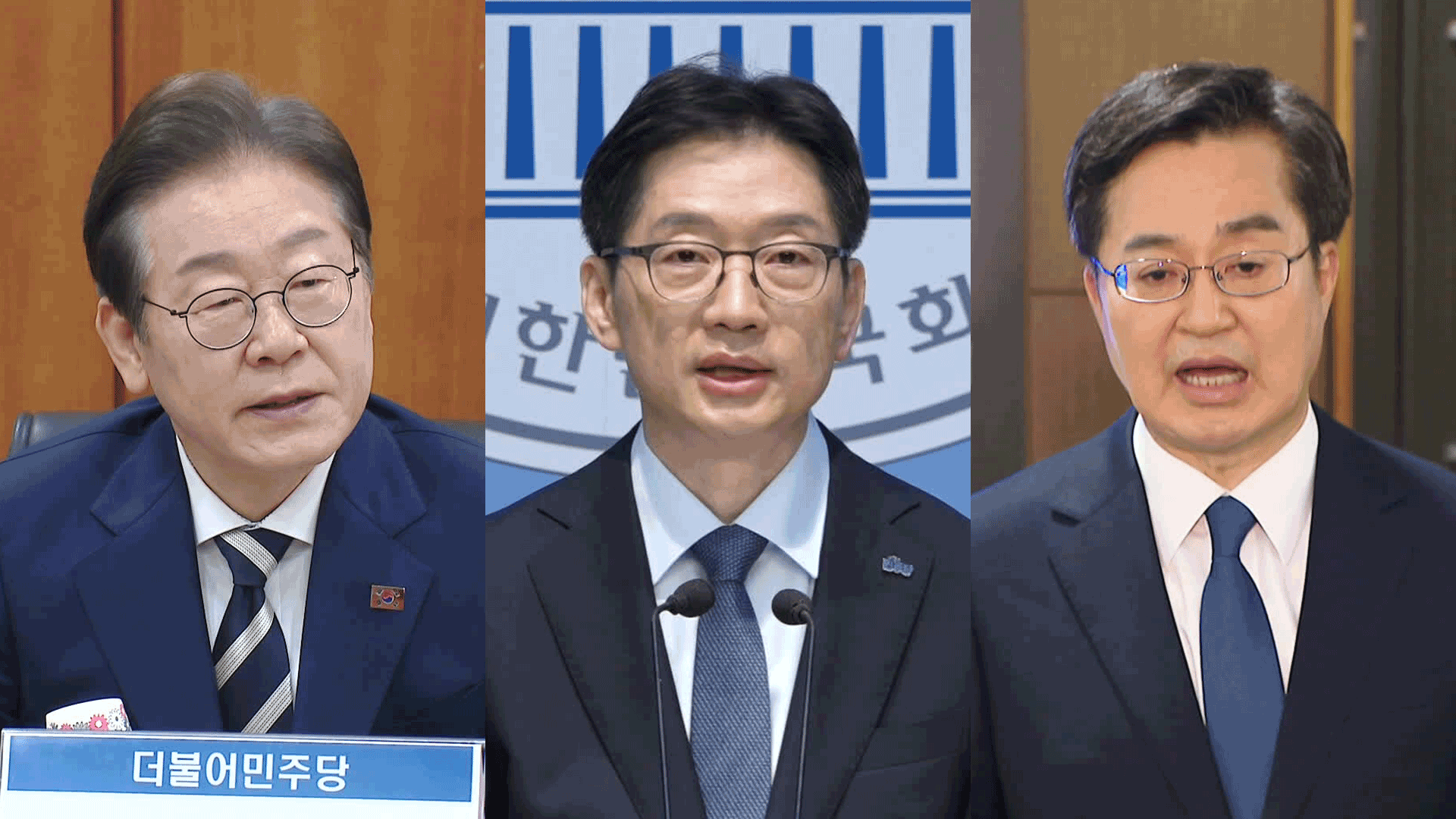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